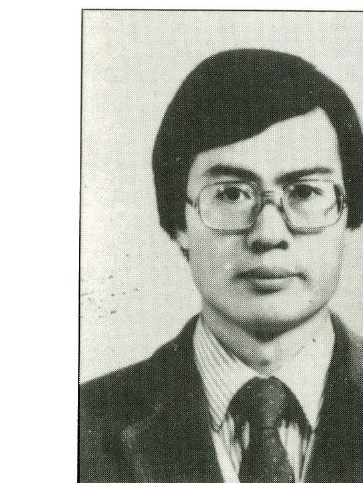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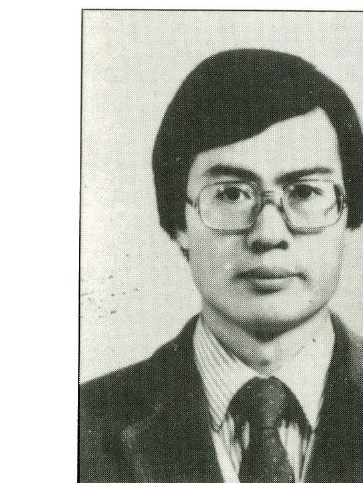
吉 熙 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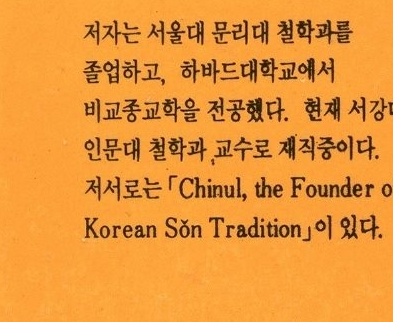 저자는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를
저자는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를
印度哲學史 吉熙星 民音社
머리말 이 책은 印度哲學의 간략한 史的 槪觀운 중과 동시에 各學派들의 哲學思想을 入門的으로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印度의 哲學的傳統은 .:::z.. 장구한 역사와 심오한 사색, 사상의 다 양성과 영향력, 그리고 산출된 문헌들의 방대함에 있어서 세계의 어느 문화권에서 형성된 철학과도 비견할 만한 전동이다. 따라서 인도는 물론 서구라파와 일본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도철학의 연구라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것은 佛敎가 우리 나라의 文化的 傳 統의 한 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독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근본적 관심 및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印度固有의 思想的 傳統에 뿌 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과의 相互作用 속에서 불교사상은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印度哲學史를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참 고서적들을 교재로 소개하면서 筆 者는 늘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을 느끼곤 했다. 이제야 겨우 대우재단의 도움으로 미홉하지만 한 권 의 책을 펴내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워낙 방대하고 難解한 인도의 철학적 문헌들을 어느 정도나마도 철처히 섭렵한다 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일생을 두고 과제로 삼을 일임에 룰림없다. 淡 學 非才한 筆 者로서 인도철학에 대한 하냐의 포괄적인 처서플 쓴다는 것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일이다‘ 자연히 이 책의 어느 부분은 필자가 좀더 잘 아는 분야이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썼 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다 행히도 인도철학에 관하여는 西 歐 語로 많은 훌륭한 개설서와 學派 別 입문서둘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워
낙 시급한 과제이기에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우선 抽 著 를 냅 윤 송구 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들의 p七正윤 받아가며 계속해서 補 完과 改
訂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傳統的 印度人들의 思考가 다분히 非歷史的이었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로서, 이것은 자연히 그들의 철학적 전통에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철학을 엄격한 의미에서 歷 史 的으로 다룬다는 것 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중요한 思想 家 와 文 !飮 둘의 年 代에 대하여부터 많은 異見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며, 그 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론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든 지 인도에 대하여는 史的 硏究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인도의 哲 學 思想울 시대적 推 移 에 따라 정치 와 사회, 그리고 文化的 상황 일반에 연결시켜 이해하거나서술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면에서 만족할 만한 처서란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 책에서 各哲學 學派가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사상의 현처한 시대적 변천을 언급하면서 서술했고, 思想의 역사적 배경이 비교적 뚜렷치 않은 學派成立 이 후의 시 기 부터 는(재 ]I 부 : 印度哲 學 의 體 系化) 주로 學派들 의 體系化된 哲學的 내용에 중점을 두어 서술했다. 그렇게 함으로 써 또한 이미 언급한 대로 史的 槪觀과 哲學入門의 구실을 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 W 부 現代의 印度思想온 매우 간략하게 취 급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의 〈現代 哲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직도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1 세기경부터 印度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印度 人口 의 약 5 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思想史는 본서에 서 거의 제외했음을 언급해 둔다. 끝으로 이 책을 쓰도록 연구비로 도와준 대우재단에 감사를 드리 며 또한 원고정리로부터 索引울 만드는 일에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 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대학원생 趙維淑양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1984 년 2 월 22 일 吉熙星印度哲學史/차례
머리말 3 제 Ⅰ 부 印度哲學의 形成 제 1 장 印度哲學의 性格 1 印度哲學의 理解 11 2 印度形而上學의 性格 14 3 認識論과 論理學 15 4 印度哲學의 發展과 時代的 區分 16 제 2 장 베다의 哲學思想 1 베다 文獻의 性格 21 2 『리그 베다』의 哲學的 思惟 23 3 브라흐마나의 哲學的 意義 26 제 3 장 우파니샤드의 哲學 1 우파니샤드의 性格 30 2 初期 우파니 샤드의 哲學 32 3 中後期 우파니 샤드의 哲學 38 제 4 장 非婆羅門系 哲學의 發興 1 歷史的 背景 43 2 六師外道 44 3 챠르바카의 哲學 46 4 原始 쟈이나敎의 思想 49 5 原始佛敎思想 52 제 5 장 小乘部派佛敎哲學의 發展 1 部派佛敎의 展開 61 2 上座部의 哲學 65 3 說一切有部의 哲學 66 4 經量部와 積子部 70 5 大衆部의 佛敎思想 73제 6 장 婆羅門敎의 再整備
1 婆羅門敎와 佛敎 76 2 쉬바神과 비슈누神의 信仰 78 3 『바가바드 기타』의 思想 80 4 『解脫法品』에 나타난 哲學思想 84 5 婆羅門的 社會倫理의 確立 85 제 Ⅱ 부 印度哲學의 體系的 發展 제 7 장 상키야·요가哲學 1 印度哲學의 體系化 91 2 상키야 • 요가哲學의 傳統 92 3 物質 95 4 精神 101 5 解脫論 103 제 8 장 勝論學派의 哲學 1 勝論哲學의 傳統 107 2 六範疇 108 3 神, 不可見力, 解脫 113 제 9 장 正理學派의 哲學 1 正理哲學의 傳統 116 2 知識의 意味와 方法 118 3 知覺의 理論 120 4 推論의 理論 121 5 比軟와 證言 125 6 自我, 神, 解脫 127 제 10 장 大乘佛敎의 展開 1 大乘佛敎의 興起 132 2 前期의 大乘經典들 137 제 11 장 中觀哲學 1 龍樹와 中觀哲學의 傳統 1422 『中論』의 哲學 144
제 12 장 後期大乘經典둘의 思想 1 歷史的 背景 148 2 唯識思想 系統의 經典 150 3 如來藏思想 系統의 經典 153 4 『梧伽經』과 『大乘起信論』 155 제 13 장 瑜伽行哲學 1 諭伽行哲學의 傳統 158 2 世親의 唯識哲學 160 제 14 장 世親 以後의 唯識哲學 1 陳那와 佛敎 認識論 168 2 法稱의 佛敎 論理學 174 제 15 장 쟈이나哲學體系 1 쟈이나 認識論 181 2 쟈이나 形而上學 183 제 16 장 미맘사學派의 哲學 1 미맘사哲學의 傳統 187 2 미맘사 認識論 189 3 미맘사 形而上學 194 4 解脫論 197 제 17 장 不二論的 베단타哲學 1 샹카라 이전의 베단타哲學 199 2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哲學 203 3 샹카라 이후의 不二論的 베단타哲學 209 제 Ⅲ 부 敎派的 哲學 제 18 장 限定不二論的 베단타哲學 1 限定不二論의 宗敎的 背景 217 2 라마누자의 形而上學 222 3 解脫論 225제 19 장 비슈누派의 베단타哲學
1 라마누자 이후의 印度哲學의 傾向 229 2 마드바의 二元的 베단타哲學 230 3 님바르카의 二而不二論 234 4 발라바의 純淨不二論 235 5 챠이타니야 系統의 베단타哲學 237 제 20 장 쉬바派의 哲學 1 쉬바派 哲學의 宗敎的 背景 241 2 샤이바 싯단타의 哲學 243 3 再認識派의 哲學 246 제 Ⅳ 부 現代의 印度思想 제 21 장 現代印度思想의 歷史的 背景 1 이슬람과 힌두교 251 2 英國의 統治와 힌두교의 改革運動 254 제 22 장 現代의 印度哲學 1 오로빈도의 哲學 258 2 라다크리쉬난의 宗敎哲學 260 부록 1 印度哲學의 實在觀 265 2 印度人의 傳統的 宇宙觀 27O 3 印度哲學 빛 政治 • 文化史 年表 272 한글·한자 색인 275 로마자색인 300제 1 부 印度哲學의 形成
제 1 장 印度哲學의 性格 1 印度哲學의 理解 철학은 驚 異 感 에서 출발한다고 흔히 말하지만철학이란 단순히 인 간의 순수한 知的 欲求몰 만족시키려고 영위되는 것은 아니다. 哲 學的 思惟의 배후와 근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철학이란 삶의 궁극 적인 문제들과 근본적인 관심사들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모색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 온삶의 문제들과관심사란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처해 있는 文化的傳統과 歷史的 狀況에 따라 많은 差異와 多樣性을 보여준다. 인도철학도 물론 印度人의 전통적 사회와문화, 그리고그들이 추 구해 온 삶의 가치와 이상을 떠 나서 理解될 수 없다. 인도인들은 전 통적 으로 인 간이 마땅히 追求해 야 할 4 가지 價値 p uru~a rth a 를 말 해 왔다. 즉 欲望 kama, 富 ar tha , 義 務 dharma, 그리 고 解脫 mok~ 이다. 이들 네 가지 가치는 모두 人間存在 자체가 필연적으로 지 니고 있는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욕망이란 인간의 본능 적인 性的 줄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며, 富란 행복한 삶의 조 건이 되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며, 의무란社會的動物로서의 인 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윤리적인 질서를 가리키며, 해탈이란 인 간이 有限한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향유하려는 종교적 潟望 에 바탕을 둔 것이다.
• 印度哲學을 硏究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인도철학의 지배적 ~ 십사는 무엇보다도 해탈의 추구에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죽, 어떻게 하면 안간이 고통스럽고 有限하고 속박된 삶을 超越하여 絶 對的이고 永遠한 自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도인의 철학적 사유의 背後에 깔려 있는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도철학은 강한 宗敎的 色彩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 다. 여기서 宗敎的이라고 하는 말은, 西洋의 전통에서처럼 어떤 초월적 인 神에 의하여 주어지는 超理性的인 啓示에 根援한 信仰活動울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活動울 하는 궁극적 목표가 종교적 욕 구를 충족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 이 서양에 있어서는 哲學은 희랍의 文化傳統에서 由來하였으며, 宗敎는 히브리적 • 聖書的 傳統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양 에서는 철학과 종교 사이에 항시 긴장관계가 존속하여 왔다. 그러 나 이러한 문화전통의 根本的 二重性을 지니지 않는 印度에서는 철학과 종교 사이에 그러한 對立關系가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인도의 종교는 그 근본성격상 어떤 超理性的 神의 啓~ 에 근거를 둔 信仰의 宗敎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신비적 체험에 바탕을 둔 경향이 강하므로, 서양에서 말하는 소위 信仰~ 理性 faith and reason 의 對立이 라는 문제 는 제 기 되 지 않았던 것 이 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인도의 종교는 철학적 종교 요, 인도의 철학은 종교적 철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인도인의 해탈에 대한 갈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 리는 그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考察 함이 중요하다. 인도인은 인간의 삶을 輪廻 sarhsara 하는 삶이 라고 이 해 했 다. 인 생은 지금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 라 植物의 世界와 같이 계속해 서 生死의 過程을되풀이하며 여러 형태의 삶을영위하게끔되어있 다는 것 이 다. 인 간이 행 한 行爲 karma 는 뿌려 진 씨 b i:j a 와 같아서 반드시 그 열매 ph ala, 죽 결과를 보고야 말며, 우리가 행한 우수한 행위는 그 結果가 現世에서 다 얻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 · 의, 혹은 하나 이상의 來世에서 그 結實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인도인의 인생관에 의할 것 같으면, 삶과 죽음은 두 개의 반’ 대 현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죽음으로써 生 자제나 혹은 生에 대한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음의 반대는 또 하나의 생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西洋의 전통적 인간관은 대체로 二分法的인 人間觀이었다. 죽 사 람은 영혼과 육체 soul and bod y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이와는 달리 안도의 인간관은 無我說 ana t man 을 주장하는 佛敎룰 제외하고 는 대체로 인간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三分法的인 인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인은 〈우파니샤드 U p an i ~ad 〉 이래로 인 간에 게 는 不生不滅의 永遠한 自 我 a t man 라는 것 이 존재 한다는 것% 인정해 왔다. 이 참자아는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現象的 自我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 참자아를 현상적 자아로부터 명 확하게 구별하여 혼동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 인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적 지혜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현상적 자아라는 것 온 몸과 마음 manas 의 복합체로서 우리들의 상식적 • 경험적 세계의 自我를 의미한다. 인도철학온 몸과 마음 사이의 어떤 본질적 차이 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양에서와 같은二元論的 인간관은발 달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참자아인 본질적 자아와현상적 자아, ~ 은 形而上學的 자아와 形而下學的 자아와의 구별이 결정적으로 重 視되게 된 것이다. 인간이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 기의 참자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현상적인 자아, 죽 거짓된 자 아와 同一視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참자아의 성격, 그리고 참자 아와 현상적 자아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인도의 哲學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두 가지 자아의 혼동된 상태를 인 생의 최대의 문제로 삼고 있음에는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참자아가 현상적 자아의 영향으로부터 解放되어 영원 한 自由룰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도철학의 근본적인 종교적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서 보. 이지 않는 實在의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思惟는 인도철학의 根幹울 이루게 된 것이다.
2 印度形而上學의 性格 럿셀 Russel 은 그의 『西洋哲學史』에서 다음과 같은 言及을 하고 있다. 세계의 성격과 구조에 관하여는 여 러 가지 假說들이 可能하다. 形而上 學 에 있어서 發展이라고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러한 假說들이 潮進 的 , 으로 다듬어지고 그 함축되었던 바가 展開되어 나오고, 경쟁이 되는 가설 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계기되는 반대들에 응수하기 위하여 그 가설들이 각각 再構成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體系들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宇 宙을 생각하는 法웅 배우는 것은 想 像 的인 줄거움이며 獨斷主 義 에 대 한 解 毒劑 이다. 더우기 이들 假說들이 하나도 중명될 수 없다 하여도 각각의 가설들을 .::L 자체와, 또한 다른 알려진 가설 등과 모순 없이 하려면 우앗 이 필요한가를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知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形而上學에 대한 럿셀의 견해를 인도철학에도 그 . 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이상학이란 宇宙의 궁극적 實 在 내 지 세계 전체에 대한제계적이고포괄적인 해석이며, 이 해석은 하나 의 가설적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科學이 發達하기 以前에는이런 解 . 釋의 體系가문자그대로받아들여져서 似而非科 學 과같은 역할을 해 . 왔지만, 오늘날 형이상학체계를 과학적 眞理나 認識으로 인정하기 는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철학자들처럼 형이상학 · 을 無意味한 것으로 破棄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형이상학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文字主義를 벗어나지 못한 소치인 것이다. 과학 적 지식이란 어디까지나 경험적으로. 實 證되는 세계 내지 itt界의 部 . 分的 認識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형이상학은 근본적으로 이와는 의 도가 다른 것이다. 형이상학은 인간이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으며 生의 方向을 設定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계 전체에 대한 知的파 악 내지 실재의 이해를 제공하는 데 그 근본관심이 있는 것이다. 인도인의 形而上學的 思考는 前에 언급한 대로 절대적 自由와 解 : 脫이 라는 理想을 앞에 놓고서 , 人間存在와 世界의 모습이 어 떠 하기
에, 혹은 質在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절대적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宗敎的 關心下에서 이루어진 것아다 .l j 앞으로. 우리가 考察하겠거니와 인도의 철학들은 이러한 관심하에서 세계의 궁극적 인 실재, 이 궁극적 실재와 현상세계와의 관계, 현상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 또 어떻게 하면 이 현상세계를 克服하고 永遠한 實在의 世界에 접하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기 제나품대로의 見解를 展開하는 것이다.
I) 印度哲學에 대 한 이 러 한 解釋읍 시 도한 著 욥 로서 Karl H. Pott er 의 Presup po- sition s of India ' s Phil o sop h ie s (Eng le wood Cli ffs, New Jer sey: Prenti ce-H all. Inc., 1963) 참조.
3 認識論과 論理學 印度哲學이 이러한강한종교적인 성격을지닌형이상학적理論움 전개했다 하여 비판적인 인식론적 성찰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사실 그와는 정반대로 인도의 대부분의 철학학과들은 자기 들의 형이상학적 세계해석을 뒷받침시키기 위해 그것과 不可分離 의 관계를 지닌 認識의 문제를 항시 다루어 왔으며 올바른 論理의 展開에 대해서도 서양철학 못지않게 관심을 지녀 왔다. 그리하여 무 엇이 인식의 타당한 방법 p ram5na 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각 학 파들은 제나름대로 學說을 提示하였다. 대체로 感覺機關을 동한 적 접 경 험 p raty ak;,a 과 이 에 근거 한 推論 anumana, 그리 고 믿을 만한 他人의 證言 sabda, 묵히 베 다 Veda 의 啓示的 權威등을 주요한 인 식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얀 하느냐는 중요한 문계로서 흔히 인도의 哲學은 그것을 인정하는 敬度한 정통 철학파 as ti ka 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면 佛 敎와 챠이 나 J a i na 敎와 같은, 비 정 통학파 nas tik a 로 구분되 기 도 한다. 타당한 인식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보이지 않는 形而上學 的 實在에 대한 見解를 달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학 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論爭을 벌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도철학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
심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思辨의 깊이를 지녔는가 하면, 다른 한편 으로는 認識論과 論理學의 엄격하고 비판적인 論 證 을 통하여 형이 상학적 思辨에 객관적 眞理性을 뒷받침시키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수있다. 4 印度哲學의 發展과 時代的 區分 인도철학은 크게 보아 4 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기는 B.C. 약 1500 년부터 B. C. 200 년 경 에 이 르는 形成期이 다. 이 時期는 우선 인도의 最古聖典인 베다가 형성된 시기이다. 특히 베다의 가장 철 학적 부분인 우파니 샤드 Up a ni~ a d 는 後世의 體系的인 철 학학파들에 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상들이 거의 모두 담겨진 文 獻 으로서 베 다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 인도문화의 총집합체라 고도 부를 수 있는 大叔事詩 『마하바라타 Mahabhara t a .l1도 대체로 B.C. 200 년경에는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 러 가 지 哲學的思想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마하바라타』의 일부분 인 『바가바드 기 타 Bhag a vad G it a 』는 힌두교의 바이 블이 라고도 불릴 정도로 유명한 聖典으로서, 비록 어떤 체계화된 秩序있는 논리에 의 거한 철학적 著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철학적 내용들을 담 고 있다. 이 시기는 또한 佛敎나 쟈이나교와 같은, 베다와 바라 문 Br 햐 mana 계급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非바라문적 철학아 등장 하여 정통 바라문교를 위협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득히 인도의 최 초의 統一王朝인 마우리 야王朝 (약 320~183 B. C. ) 때 에 는 불교는 아 쇼카王 (269~232 B. C) 의 歸依를 받아 印度全域뿐만 아니 라 인근지 역 에까지 퍼지는 하나의 世界宗敎로 성장하게 되었다. 인도철학의 제 2 기는 B.C. 200 년경부터 시작하여 A.D. 1000 년 경에 이르는 體系的 發展期이다. 佛滅後부터 발생한 센鼎 E 의 敎理的 理解의 差異들은 철학적으로 多 樣化되고 深化되어 마침내 20 여개의 部派佛敎둘의 對立울 보게 되 었으며 , 그 중의 有力한 部派들은 자기 의 철 학적 立場을 〈論 abhid • barma 〉의 형식으로 體系化시키게 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上 座部 Therav a da 와 說 一切有 部 Sarvas ti v ada 의 論둥 이 다. 이러한 佛敎의 哲學的 活動에 자극을 받아 바라문敎內에서도 다 양한 思想들이 각기 獨立的으로 체계화되어 表現되게 되었다. 이들 은 각기 자기 의 철 학적 입 장을 〈經 s iit ra 〉의 형 식 으로 간략하게 記 述했다. 미 망사 Mi m amsa 학파의 『미 맘사 經 Mi m amsa-sii tra .!I , 베 단 타 Vedanta 학파의 『브라흐마經 Brahma-s iit ra 』, 냐야 Ny a y a 학파의 『냐야 經 N y a y a-s iit ra 』, 바이셰시카 Vais e ~ik a 학파의 『바이셰시카 經 Va i se~ i ka-s iit ra 』, 상키 야 Samkh y a 학파의 『상키 야碩 Samkhy a - k죠 r i ka 』, 요가 Yo g a 학파의 『요가經 Yo g a-s iit ra』 등은 모두 이 體 系 化시대의 前半期에 씌어진 文獻들로서 소위 正統六派哲 學 의 根本經 典들인 것이다. 이들 철학적 경전들은 그 내용이 지극히 간략하고 함축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연 히 그들에 대한 証釋書 들이 씌어지게 되었으며, 이들주석서들은또 한 다른 많은 復証를 산출하게 되었다. 印度哲 學 의 理論的인 發展 온 이러한 주석적 활 동을 동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西 洋의 哲學이 다분히 個人中心的으로 이루어진 것과 좋은 대조를 보 여주는 것으로서, 印度의 傳統 的 哲學者둘은 아우리 자기가 새로 운 사상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속한 學派를 중심으로 하여 그 學派에서 권위로 여기고 있는 經典이나誌釋을해석하는형 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印度人은 본래부터 歷史意識이 약하다고 혼 히 말하거니와 이와 같이 傳統을 重視 하는 學派中心的인 철학활동 온 印度의 哲學的 思想들의 無名性과 非底史性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인도철학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자들과 그들의 처서둘의 年代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 인도철학의 제 2 기에는 또한 大乘佛敎가 興起하여 많은 大乘經典 들을 낳았고 이 와 더 불어 大乘敎 學 도 발달되 어 中競 Madhy am i ka , 1ifc{ 伽行 Yo g acara 과 같은 학파들이 성 립 되 었 다. 이 들 대 승불교의 철 학 들은 婆羅門의 정몽 철학학파들과 활발한 철학적 논쟁과 교류를 초 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도철학의 제 3 기는 11 세기부터 18 세기 초에 이르는기간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이 시기는 인도가 이슬람교도들의 침공을 받아 그들 의 정치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때이다. 佛敎는 이미 인도의 本 土 에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베다 종교와 四姓階級제도를 기 반으로 한 正統바라문교는 土 着 的인 여 러 種族둘 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에 習合되어 현재 우리가 〈힌두교 Hi ndu i s m 〉 라고 부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대중적인 종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비 슈누 V i훈 nu 神과 쉬 바 S i va 神의 信 仰 運動 이 인도의 전 역 에 盛行 하 게 되었으며, 哲學도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아 다분히 敎派 的인 神 學的 救援論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제 2 기 體 系的 發展期의 각 학파들이 계속해서 철학적 활동을 전개하여 많 은 주석서와 입문서 내지 개론서들을 産出했으나, 인도철학의 창 조적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18 세기부터 본격화된 영국의 印度支配로부터 시작하 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인도철학의 제 4 기로 잡을 수 있 다. 이 시기는 인도의 知性人들이 서구라파의 사상과 學 問에 접하 여 그들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전통을새로이 發見하게 된 시기로서, 이에 힘입어 힌두교의 改革運 動 도 活發히 진행되었고 인 도철학의 세계관을 外部世界에 소개하는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 나 철학적으로는 아직 두렷하게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 참고문현 I 힌두교 및 印度文化 全般에 관한 책들 Basham, A.L., The TiV onder tha t was Iudia . New York, 1954. 이술람 지배 이전의 印度文化 全~l!:에 관한 정평있는 개설서. de Bary , W. T. ed. , Sources of Iudia n Tradit ion. New York, 1958. 인도의 문화, 종교 전몽에 관한 古 典的 자료들의 英譯編集. Bechert, H. und von Sim son, G. , Ei nf i ihr ung in die Iudolog ie, St an d, Meth o den, Ai efga ben. Darmsta d t, 1979. 印 度學 全般에 관한 硏究方法, 文 獻 등의 소개.
Embree, A. T. ed., The Hi nd u Tradit ion . New York, 1966. Sources of India n Trad itio n 과 같은 종류의 책 . Elio t , C., Hi n duis m and Buddhis m . 3 vols. London, 1922. 힌두교와 불교에 대한 개설서. Farqu har, J. N., An Outl ine of the Reli giou s Lit er atu re of India . Oxfo r d, 1920. 인도의 종교문헌들에 대한 해설서· Hop k in s , T. J., The Hi n du Reli giou s Tradit ion. Califo rnia, 1971 . 힌 두교에 대한 간략한 史的개설서· Heim ann, B., Facets of India n Thoug h t. London, 1964. 印度文化의 思想的 특칭 들에 관한 동찰력 있는 연구. Maju m dar, R. C. , H. C. Rayc h audhuri, and K. Datt a, An Advanced Hi st o ry of India . London, 1950. 先史時代로부터 獨立에 이 르기 까지 의 印度의 정치, 경재, 사회, 종교사. Renou, L., Reli giou s of Ancie n t India . London, 1953. 힌두교에 대한 간략한 入門 畵 , La Ci vi l i s a ti on de /'lnde Ancie n ne. Paris , 1950. 印度學大家 에 의 한 印度古典文化의 槪說 書 . Thapa r, R. A Hi st o ry of India . Vol. I. Baltim o re, 1966. 16 세 기 초 무굴계국 이전까지의 印度史槪說. Wi nt e r nit z, M. Gesch ich te der i'lldi s c hen Li ter atu r. 3 vols. Leip zig, 1909~1920. 印度文學史의 權威있는 著 書 . S. Ke t kar 의 英鳳 Hi stor y of India n Lit er atu r e. 2 vols. Calcutt a, 1927~ 1933. II 印度哲學 全般에 관한 綜合的인 책들 Bhatt ac hary ya, H., ed., The Cult ur al Herit ag e of India . Vol. ill : The Phil o sop hi e s . Calcutt a, 1953. 印度學者들에 의 한 各哲學學派들에 대한槪說. Chatt er je e , S. and D. Datt a, An Intr o ducti on to India n Phil o soPlzy. 印度哲學에 관한 明快한 入門 害 . Cowell, E. B. and A. E. Goug h , tra ns. Tlze Sarva-Darsana-SaT? Zgr aha. London, 1914. 14 세 기 의 인도철 학자 M 죠 dhava 의 『全哲學 體 系 網 要』의 英譯 Deussen, P. , Allge mein e Geschic h te der Ph ilos oPh ie. Vol. I , 1-3. Leip z ig , 1894. 有名한 베단타哲學 硏究家에 의한 世界哲學史의 一部로
서의 인도철학사. Dasg upta, S., A Hi st o ry of India n Plzil o sop hy . 5 vols. 印度哲學에 관 한 綜合 89 인 서술로서 가장 상세한 책. Frauwallner, E. , Gesclzic ! z te der i11 dis c hen Plzil o sop lz i e. Salzburg, 1953. V. M. Bedekar 의 英鳳 Hi st o ry of l11dia 1 1 Phil oso p hy , 2 vols. Delhi, 1973. 未完成된 印度哲學史. Glasenap p, H. v. , E11t w ic k lu11g s slr tfe11 des i11 dis c he11 De u keus. Halle, 1940. 독일의 印度哲 學硏究 의 大家에 의한 印度思想發 展史 . Die Phil o sop h ie der Inder. Stu tt ga rt, 1974. 印度哲學의 간 략한 底史와 學派別 槪說. Hiri y an na, M. , Outl ine s of I11dia 1 1 Phil oso p hy . London, 1932. 널 리 읽혀지는 印度哲學槪說 홉 Pott er , K., Presup po sit io11 s of India n Phil o sop hy . Eng le wood Cli ffs, 1963. 印度哲學의 이 해 물 위 한 根本前提들에 대 한 새 로운 고찰. , ed., Bi bl io g r aph y of l11dia n Phil o sop h y . 印度哲學의 연구를 위한 거의 완벽한 참고문헌들의 분류와 열거. Nakamura, H., Reli gion s and Phil o sop hi e s of India : A Surve y wi th Bi bl io g r aph ic a l Note s . 3 vols. Toky o , 1973. 日 本의 印度學大家에 의 한 印度宗敎 • 哲學 硏究指針 書 . Radhakris h nan, S. India n Phil o sop hy . 2 vols. London, 1923, 1927. 現 代 印度知性의 代表者 중의 하나에 의한 인도철학 전동의 상세한 해설. Radhakris h nan, S. and C. A. Moore, eds. , A Sourcebook in India n Phil o sop hy . Prin c eto n , 1957. 印度哲 學 의 第一次的 資料들 (英譯) 을 발 췌하여 편집한 없本. Ruben, W. Geschic h te der i1ldi s c hen Phil o sop hi e . Berlin , 1954. 唯物論 的 관점에서 씌어진 印度哲學史. Sharma, C. India n Phil o sop hy : A crit ical survey. New York,· 1962. 印度哲學學派에 관한 明快한 해설서. Zim mer, H. Phil o sop h ie s of India . Prin c eto n, 1951. 印度哲 學 全般에 관한 심오한 해설서. 宇井伯 壽 , 『印度哲 學 史』· 金倉圓照, 『 4 `/ F 哲學史』· 中村元, 『 4 `/ F 思想史』·
제 2 장 베다의 哲學思想 1 베다 文獻의 性格 印度에 있어서 철학적 思惟의 起源은 힌두교의 最古聖典이며 대 부분의 정동 철학학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베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다 문학을 産出한 사람들은 서력기원전 약 1500 년경부 터 인도의 서북부를 침입하여 原住民들을 정복하고 새로운 삶의 根 振를 마련한 아리안 A ry an 族들이었다. 그들은원래 지금의 코카사스 지 방의 북쪽 草原지 대 에 서 살던 遊牧民으로서 소위 인도유럽 Indo - Europ e an 언 어 계 통의 種族들 중의 一部였 다. 이 들 인도유럽 종족들은 서력기원전 약 2000 년경에 草原을떠나다른곳으로移動하게 되었으 며 서쪽으로 간 종족들은 지금의 유럽의 제민족을 형성하였으며 동 쪽으로 이동한 아리안족들은 한편으로는 이란지방에 定着하고 다 론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올 통하여 인도의 서북부를침입하여 들 어온 것이다. 그들은 二輪馬車를 타고 靑銅으로 만든 武器룰 들고 싸우는 씩씩한 戰士둘로서 약 1500 년에서 1000 년 사이에 五河地方 Pan j죠 b 웅 점 령 하고 베 다文化를 이 룩한 것 이 다· 그들의 言語는 산스 크리 트 Sanskr it語로서 인도유럽 계 몽의 언 어 에 속한다. 베다는 물론 오랜 세월을두고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대략 현재의 형태물 . ;갖추게 된 것은 A.D. 약 200 년 전후로추정된다. 베다는 원 래 고대 인도인들에 의하여 神에 대한 예배와 재사의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神에 대한 祭 式들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그 祭 式들을 주관하는 司祭 의 직 분 도 4 그 룹 (ho t r, udg a tr , adhvary u , brahman) 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베다도 이 그룹 들 에 의해 사 용 되 는 用 途 에 따라 『리 그 베 다 B.g Veda 』, 『싸마 베 다 Sama Veda 』, 『야주 르 베 다 Yaju r Veda 』, 『아타르바 베 다 At h arva Veda 』의 4 種 으로 구 별되어 渠 成되게 되었다. 이 중에서 宗敎 的으로 가 장 重要하 고 또 어느 정도의 철학적 가치를 지닌 것은 『리그 베다』이며, 『아타르바 베다』에서도 간 혹 철학적 사변을 찾아볼 수 있다. 각 베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결과 자연히 그 안에 각기 시 대의 추이룰 반영하는 여러 충의 문헌이 누적되게 되었다. 따라서 上記 4 種 의 베다는 각기 4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는 주로 神들에 대 한 讚歌 와 기 도인 만트라 man t ra 를 수집 한 本集 Samhit a 이고, 둘째는 祭 儀 의 방식과 의미들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散 文으로 된 브라흐마나 Brahma 1,1 a 이 며 , 이 브라흐마나의 끝에 소위 密林 書 Aran 'y aka 와 철 학적 내 용이 가장 풍부한 우파니 샤드 U p an i흔 ad 가 부록처럼 담겨 있다. 바라문교의 전통에 의하면 앞의 두 부분은 주 로 祭 儀 플 中心으로 한 인간의 行爲와 義 務가 주요 내용이므로 〈行爲篇 Karma-ka 1,1 9a 〉이 라고 불리며, 뒤의 두 부분은 철학적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아 루었 다고 하여 〈知 識 篇 Jfian a-k a 1,1 9 a> 이 라고 부른 다. 실제에 있어 우파니샤드는 인도의 철학사상의 원천을 이루는매 우 중요한 古典이며, 베다의 멘 끝에 있다고 하여 베단타 Vedanta 라는 別稱도 갖고 있다. 인도사상을 연구하는 學 者둘은 本 集 은 詩 人둘이 지었으며 브라흐마나는 司祭들의 産物이며, 우파니샤드는 철학자들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각 부분의 특징을 잘 드러낸 말이 라 하겠 다. 아라냐카 Ara 1,1y aka 는 브라흐마나의 제 사 중심 적 사상 에 서 우파니 샤드의 철 학적 • 形而上學的 思辨으로 넘 어 가는 과도기 를 대표하는 문헌으로서 그 성격 역시 뚜렷하지 않으며 종종 브라흐 마나나 우파니샤드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제 각부분에 나타난 철 학적 思惟플 考察해 보자. 1)
1) 〈베다〉라는 말은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使用된다. 陝義 로 사용될 때에는 本 集 의 部分만 을 의 미 하나 廣 義 로는 브라흐마나와 우파니 샤드 를 모두 포합하여 일 컫는 말이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중은 의마로 사용하기로 한다.
2 『리그 베다』의 哲 學 的 思惟 고대 인도인들은 自然 의 세계에 대하여 무한한 신비감과 경이감 울 가졌다· 그 들 은 자 연 현상을 現代人둘이 보는 것처럼 엄격한 因 果 의 法則에 의하여 지배되는 機 械的인 體 系로 본 것이 아니라 생 동하는 신비스러운 힘에 의하여 지배되는 살아 있는 存 在 로 본 것 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神 秘 스러운 自然現 象 울 이해함에 있어 그들 은 각 현상의 배후에 어떤 살아 있는 人格的인 힘이 지배하고 있다 고 생각했으며 기도와찬양과 제사를 통해 이 힘들과 인격적인 관계 룰 가지 려 했 다. 이 러 한 인격 화된 자연의 힘 들이 『리 그 베 다』의 1028 개 碩歌 둘의 대상아 되고 있는 여 러 神 deva 들인 것이 다. 이 神둘 은 자연세계에 있어서의 그들의 活動領域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죽, 우주 질서의 보호자라고 불리는 바루나 Varui;i a, 하 늘의 신 댜우스 Dy a us, 태 양의 신 미 트라 M it ra 와 수리 야 Sur ya 等 과 같은 하늘에 속하는 신들, 천둥과 폭풍의 신 인드라 Indra, 폭풍 우의 신 마루트 Maruts , 바람의 신 바유 V 료yu와 같은 空中올 장악 하는 神, 그리고 제사 때 없어서는 안되는 불의 신 아그니 Ag ni, 祭酒 소마 Soma 神, 땅의 신 프르티 비 P 먀hi v i와 같은 地上의 신들인 것이다. 이러한 自然의 神들 以外에도 베다의 詩人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人格神化하여 찬양을 했 다. 예를 들어 말( 言語 )의 神 Vac 이 나 祈 諸 의 主 Brhas p a ti와 같은 존재들이다. 베다人들은生物과無生物, 人格과 事 物, 精神과 物質, 實體와 屬性이 아직 확연히 구별되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 .2)
2) H. v. Glasenap p: Di e Phil oso p h ie der Inder (Stu ttga rt: Alfr ed Kroner Verlag, 1974) , p. 25.
神들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세계 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베다의 시인들은 인식했으며 이 우주의 法則性을 〈르타 #a 〉라는 개념으로표시됐다. 〈르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語의 動詞 vr, 죽 〈간다〉는 듯을 지닌
말에서부터 나온 것으로서, 사물들이 자연적으로 취하는 어떤 일정 한 과정 course 을 의 미 한다. 이 는 中國의 道의 개 념 에 相應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미 언급한 바루나神은 바로 이 우주의 질서 및 인간 행위의 道德的 秩序룰 관장하고 있는 神으로서 고대 인도인의 상당 한 철학적 추상적 思考力을 나타내는 神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 때 문인지 『리그 베다』에서 바루나의 숭배는 그렇게 성했던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아리안族들의 戰爭의 神으로 간주되는 폭풍의 神 인 드라나 혹은 재사에 없어서는 안될 불의 신 아그니가 더욱 많은 베 다人들의 종교적 관심 을 끌었 다. 그러나 베다에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계를 여러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多神敎的 思考方式 외에 이 미 세계의 諸現象 내지 힘들의 背後에 있는 어떤 통일적인 存在의 原理에 대한 意識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 통일적 원리는 프라쟈파 티 Pra j a p a ti나 비슈바카르만 V i svakarman 과 같이 세계의 창조神으로 서 이해되기도 하였고, 또는 아무런 인격적 신의 성격도 지니지 않 는 추상적 • 형이상학적 개념인 一者 Tad Ekam(That One) 로서 이해 되기도 하였다· 프라챠파티는 〈生物의 主〉라는 뜻을 지녔고, 원래 는 다른 神둘의 칭호로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독립적인 創造의 神 으로서 널리 숭배되었으며, 비슈바카르만은 〈모든 것을 만든 者〉라 는 뜻으로 역시 인드라나 태양신들과 같은 신들의 別稱이었던 것이 독립적으로 人格化되어 세계 창조의 神으로 崇拜되게 된 것이다. 한편, 『리그 베다』에 나타난 一元論的인 形而上學的 思惟의 가장 좋은 例는 〈創造~ Hy m n of Crea ti on 〉이 라고 불리 는 다음과 같은 철 학적인 詩이다 . 太初에 有도 없고 非有도 없었다. 空氣도 없었고 그 위의 하늘도 없었 다…… 死도 그때는 없었고 不死도 없었으며 밤이 나 낮의 표칭도 없었다. 一者만이 그 自體의 힘에 의하여 바람도 없이 숨쉬고 있었고, 그 外에 아 무것도 없었다. 처음에 어둠이 어둠에 가리워 있었고 어떠한 표징도 없 이 이 모든 것이 물이었다. 허공에 의하여 덮여진 것, 그 一者가 열에 의 하여 생겨났다. 처음에 그 一者 속으로 欲望이 들어갔다. 생각의 산물,
그 최초의 씨. 賢人둘이 마음에 지혜로서 찾으매 非有 속에 有의 連結옹 발견했다……창조적 힘과 비옥한 힘이 있었고, 아래에는 에너지 위에는 충동이 있었다……諸神도 이 세계의 창조 후에 태어났다. 그러니 누가 이 세계가 어디로부터 생겼는지 알겠는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세계를 살피는 자, 그만이 알겠지. 아니, 그도 모를는지도 모른다 .3 ) 이 創造碩은 그 내용과 表現에 있어서 不分明한 접둘이 많이 있 으나 여기서 말하는 一者란 어떤 人格的인 意志를 지닌 神이 아니 며 이 世界도 神의 창조에 의했다기보다는 이 하나의 最初의 原~ 로부터 전개해 나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諸神들은 이 세계 의 창조 이후에 생겼다고 언급함으로써 多神敎的 세계관을 分明히 초월하고 있다. 물론 이 一者라는 형이상학적 實在가 우파니샤드 에서처럼 아직 완전히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숨〉, 〈욕망〉 등의 표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이 一者가 열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 元論的 思考가 철저하지 못함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리그 베다』 의 다른 한 곳에서는 말하기를 〈하나의 實在룰 詩人둘은 여러 가지로 부른다〉 4) 고 하여 諸神들이 보다 더 궁극적 인 實在의 多樣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一元論的인 思惟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S. Radhakris h nan and C. A. Moore, ed., A Sourcebook in India n Phil oso p h y (Pr inc eto n , New Jer sey: Prin c eto n Univ e rsit y Press, 1957) , pp. 23~ 心학尸터 4) 번J역l.g. Veda, I. 164. 46 : ekam sad vip ra bahudha vadanti .
베다의 神둘은 宇宙의 自然秩序뿐만 아니라人間의 禍福과道德秩 序까지 관장한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인간의 제사의 행위와 도덕적 行爲의 善惡에 따라 적당한賞罰울 내린다. 그러나이 도덕의 질서는 어디까지나 神과의 關係에서 이해되며, 우파니샤~ 以後에 있어 서처럼 엄격한 非人格的 因果律의 성격을 지닌 카르마 karma 의 法 則은 아니다. 인간은 그 행위의 결과를 死後의 세계에서 얻는다는 思想이 나타나 있으며, 善한 사람은 天上에서 神들과 함께, 혹은 祖 上들과 함께 영 원히 幸福한 삶을 누린 다고 베 다인들은 생 각했다. 한 편 인간은 죽으면 그의 눈은 태양, 숨은바람, 말은불, 귀는 四方, 마음은 달에로 돌아간다고 하는 인간을 하나의 小宇宙로 보는 사상
도 찾아볼 수 있다. 영혼의 不滅을 믿은 것 같으나 영혼에 관한 분 명한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끝없 는 輸廻의 世界에서 生死룰 되풀이해야 한다는 사상이나, 그에 수 반되는 解脫의 理想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대제로 베다人들의 世界觀온 樂天的이며 現世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3 브라흐마나의 哲學的 意義 브라흐마나는 本集을 說明하고 解釋한 注釋 書 로서, 주로 祭祀 의 방식과 의미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文 獻 이다. 정확한 年代 는 알 수 없으나, 약 B.C.900 年부터 700 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추 정된다. :::::z... 중에서 量 的으로 가장 방대하고 內容上 가장 중요한 것 은 『야주르 베 다 Yaju r Veda 』에 속해 있는 『샤타파타 브라흐마나 Sata p a tb a Brahma I_J. a 』이 다• 브라흐마나는 :::::z... 내 용상, 제 사의 방식 과 규범 을 취 급하는 부분인 儀軌 V i dh i와, 本集의 여 러 碩歌 Mantr a 의 意味, 語源 및 祭祀의 起源과 傳說 등을 말해 주는 부분인 釋義 Ar t havada 로 구분된 다. 브라흐마나의 사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 은 祭祀의 萬能化이며, 이 제사가 모든 사상적 關心의 촛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時間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强化되어 간 婆羅門, 죽 司祭계급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본래 계사는 神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거나 혹은 신들의 厚意를 祈 願하는, 어디까지나 神 中心의 행위였지만, 祭祀儀式이 점점 전문화 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제사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람 들은 제사 자체의 勅能울 믿는 나머지 神들조차도 제사 없이는 아 무런 힘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神둘 이 아니라 바로 울바른 제사의 행위 자체이며, 따라서 祭祀는 宇宙 的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考察하겠지 만, 正統哲學學派 中의 하나인 푸르바 미 맘사 P ii rva-m1mams 료학파는 이러한 사상의 계승자로서, 神의 存在조차 아무런 의미를지니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祭祀믈 우주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상은 『리그 베다』 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예컨대 『리그 베다』 10 권 90 송에는 신들에 의하여 한 宇宙的 人間 Puru~a 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온 세계 전 체가 생겨났다고 한다. 즉, 그의 눈으로부터 해, 마음으로부터 달,. 입으로부터 인드라와 아그니神, 그리고 숨으로부터 바람의 신 바유, 그의 배꼽으로부터 空中圈, 머리로부터 하늘, 발로부터 땅, 귀로부 터 四方이 생겼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다 自體와 四姓階級도 이 제 사로 인하여 생 겨 났다고 한다 . 즉 바라문 Br 랴 ma i:i a 은 그의 입 이 었고 크샤트리 야 K~a t r iy a 는 그의 두 팔, 바이 샤 Va i s y a 는 그의 두 넓 적 다리 , 그리 고 슈드라 S ii dra 는 그의 발이 었 다고 한다. 이 碩은 여 러 가지 象徵的인 意味를 지녔지만, 무엇보다도 최초의 제사행위 자 제가우주질서의 根本이 되어 있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흐 마나에서는 이런 祭祀主義的 宇宙觀이 더욱더 發展하여 祭式을 情成 하고 있는 여러 要素들을 우주의 여러 神둘이나 힘들과 상징적으로 相應시켜서, 祭式이 宇宙秩序 自體의 근본이 되며 祭式의 힘이 宇 宙의 힘 자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제식을 주관 하는 바라문계급도 신들과 同等한 위치의 存在로 간주되고 있다. 『샤 타파타 브라흐마나』는 말하기를, 〈神에 두 종류가 있다. 神은 神이 며, 學識에 있어서 베다에 通暎한 바라문은 人間的 神이다〉라고까 지 말하게 된 것이다 .5) 이러한 제사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인도철 학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두 가지 사상이 싹트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5) Sata p a th a Briih 1 na~a, II . 2, 2, 6,
첫 째로, 브라흐만이 라는 宇宙 Brahman 의 統一的 原理로서 의 實在 룰 나타내는 槪念의 전개이다. 이 개념은 베다에서 이미 발견되며, 碩歌나 기도 내지 呪術의 말, 혹은 그 말에 들어 있는 신비한 힘을 뜻했다. 그러나 祭式의 權能을 강조하는 브라흐마나에 와서는 계 사에서 司祭들이 사용하는 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 말은 계사 의 核心을 이루는 제사의 힘의 根源이기에 동시에 온 萬有와 諸神 둘의 背後에 있는 근원적인 실재 내지 힘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샤타파타 브라흐마냐』는 말하기를, 〈참으로 최초에 이 세계는 브
;라흐만이었다. 그것이 神둘을 創造했고, 그 후에 그 신들로 하여금 • 이 세계들에 오르게 했다. 즉, 아그니는 땅 위에, 바유는 공중에, 수 '· 리 야 하늘에〉 6). 죽 브라흐만은 神들과 구별되며 그들의 힘의 근원 · 이 되는 더 궁극적인 힘 내지 宜在인 것이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은 : 동시에 제사를 主管하는 바라문계급에도 內在하고 있는 神秘的인 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브라흐만의 개념은 우파니샤드에 와서 더욱더 深化되고 發展되어 인도철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重要한 槪念이 되었다.
6) S, ahap a th a Briih m att a 지. 2. 3.1
제사주의적인 브라흐마나의 사상에서 두번째로 유의할 점은 엄격 한 行爲의 因果律에 대한 믿음이다· 브라흐마나에서 行爲라 함은 ' 주로 祭祀의 行爲로서, 올바론 방법으로 행한 행위는 자연의 法則 과 마찬가지로, 神의 뜻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그 結果를 초래하 게끔 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리그 베다』에서 自然의 法則울 의마 하던 르타 rta의 개념은 브라흐마나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祭祀儀式과 그 제사행위로 하여금 그에 合當한 결과를 必然的으~ 초래하게끔 하는 행위의 法則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인도철학에 있어서 철대적인 大前提이다시피 한 카르마( 業 )의 법칙에 대한 믿 음은 이런 브라흐마나의 제사주의적인 思考에서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祭式主義的인 思想 외에도 브라흐마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철 학적 思惟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現象세계를 成立시키고 있는 근 본 五元素說의 始初를 볼 수 있으며, 人間의 本質에 관해서도 精神 과 肉體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前者를 〈아트만 a t man( 自 我)〉, 〈마나스 manas( 意根)〉, 〈프라나 p rana( 숭)〉 등의 이 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개념들에 대한 思惟는 브라흐마나 이후에 더 욱더 발전되어 각기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만, 그 시도가 브라흐마나에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트만과 같이 중 요한 개념이 숨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매우 意味있 는 일로서, 우파니샤드에도 아직 이와 같은 사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현 Berga ig n e, A., La reli gion vediq u e d'ap res /es Hy m nes du R ig-V.려a. ' 3 vols. Paris , 1878. Bloomf iel d, M. , The Relig ion of the Veda. New York, 1908. __ _, tra ns., Hy m ns of the At ha rva Veda. Sacred Books of the East (SEE) , XLII. Oxfo r d, 1897. Eg ge li ng , J., tra ns., Sata p at h a Brahma,:z a . Sacred Books of the East (SEE), XII, XXVI, XLI, XLIII, XLIV. Ox for d, 1882~1900. Geldner, K. F., tra ns., Der Rig -V eda. Harvard Orie n ta l Serie s , Vols. 33, 34, 35. Cambrid g e , Mass. , 1951 . Griff ith, R. T. H., tra ns., The Ri g Veda. 2nd ed. 2 vols. Benares, 1896~1897. Keit h, A. B., The Relig ion and Phil o sop hy of the Vedas and Up an i- shads. Cambrid g e , Mass., 1925. , tra ns. , Ri g Veda Brahma,:z a s: The Ai tar eya and Kau$ 'if函 Bralzma,:z a s of the Ri gv eda. Cambrid g e , Mass., 1920. Levi, S., La doctr i n e du sacrifi ce dans les Brahma 꼬 as. Pari s, 1898. Macdonell, A. A. Vedic My tho log y. Str a ssburg, 1897. O'Flaherty , W., tra ns., The Ri g Veda: An Anth o log y. Harmond s- worth , Eng la nd, 1981 . Oldenberg, H., Di e Relig ion des Veda. 3rd edition . Berlin , 1923. , Die W elt an schauung der Brahma 7J a-Te 갔 e. Gott inge n, 1919. Muller, M. and H. Oldenberg. , tra ns., Vedic Hy m ns. 2 vols. SBE, XXXII, XLVI . Ox for d, 1891~1897. Renou, L. , Relig ion s of Ancie n t India . London, 1953. Whit ne y, W. D. , tra ns. , The At h arva Veda. Cambri dg e , Mass. , 1905.
제 3 장 우파니샤드의 哲學 1 우파니샤드의 性格 베다와 브라흐마나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한 고대 인도인에 의 한 세계의 통일적 원리에 대한 사유는 우파니샤드에 와서 그 질 정을 이룬다.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경험적 현상을 궁극적인 · 실재로 보지 않고 그 根底에 보이지 않는 통일적인 實在룔 探求하려는 形 而上學的인 思惟이다. 이 사유는 宗敎的으로는 人格化된 自然現象으 로서의 諸神둘의 여러 形態나 性格을 超越하여 그들의 背後에 있는 보다 더 根本的인 하나의 神에 대한 追求로 나타난다. 여러 특수· 한 성격과 모습을 지닌 諸神들은 아직도 現象의 세계에 머물러 있 는 有限한 存在둘로서 , 모든 존재의 궁극적 原理를 추구하는 우파나 샤드의 哲人돌의 마음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i. 들이 추구하는 철학적 思惟의 目標는 그것을 앎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단 하나의 根源的인 實在 그 自體였던 것이다. ~ 과니샤드主노 이런 古代 印度人의 형이상학적 정열의 産物로서, 그후 의 인도철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베다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베단타 Vedan t a( 베다의 끝 혹은 목적)라고도 불리며, 六派哲學의 하나인 베단타 철학의 基盤을 아물 뿐만 아니 라, 다른 모든 학과에까지 至大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미 言及한 대로 베다는 그 內容에 있어서 인간의 行爲, 득하
祭祀의 義 1% 와 規定을 다루는 行爲篇 Karma-ka i;iq a 과, 형 이 상학적 지 식 을 다루는 知識篇 J nana_kanda 으로 구별 되 어 왔다. 우파니 샤 드는 이 後者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니샤드에는 형이상학적 사유 이외에도 아직도 브라흐마나에서와 같이 祭儀에 관한 여러 가지 雜多한 思想들이 섞여 있지만, 그 獨特한 철학적 意義는 어디 까지나 형이상학적 思惟에서 發見되는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形而上學的 思惟는 결코 단순한 知的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시 변하는 有限하고 고동스러운 현상세계 자 체를 초월하여 영원한 實在에 도달하려는 새로운 宗敎的 湯望에 立 脚한 것이었다. 우파니샤드에 와서는 古代印度人들은 인간의 運 命이 란 카르마의 法則에 의 하여 輪廻의 世界에 서 끝없는 生死몰 되 풀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마치 풀벌레가 한 잎사귀에 서 다른 잎사귀로 옮겨 가듯이 사람은 한 生이 끝나면 다른 모습으 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니샤드 哲人둘의 關心은 어떻게 하여야 이런 目的없는 無意味하고 고통스러운 生死 의 되풀이에서부터 해방되어 절대적인 삶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촛점 을 모으게 되었다. 이러한 끝없는 生死의 되풀이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올바른 行爲란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계사의 행위 이거나간에 이미 그 女加力울 상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행위는 어 떠한 것이든간에 반드시 그 結果몰 초래하게끔 되어 있어, 아무리 善한 行爲라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윤회의 세계에 속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기 때문이다. 善한 業報를 받는다 해도 이 현 상세계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니샤드의 철인들은 절대적인 삶의 발견을 위해서는 行爲가 아니라 宇宙의 永 遠하고 絶對的인 實在 自體몰 아는 知識 jii ana 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 닫게 된 것이다. 여기서 브라흐마나의 祭祀를 中心으로 한 행위주 의적 철학이 克服되게 되는 것이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근 知識 이란 경험적인 현상세계를 對象으로 하는 日常的인 지식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神秘한 지식이었다. 따라서 우파니샤 드의 哲人들은 이 신비한 지식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달하지 않 았고,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관계 아래서 조심스럽게 聖스러운 知
識으로서 傳授했 던 것 이 다. 〈우파니 샤드 Up a ni~ a d> 란 말은 〈가까이 앉는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선생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 對話를 동하여 秘義的인 지식을 전수했다는 데서 주어진 이름이다. 따라서 우파니샤드의 眞理探求는 주로 대화의 형식으로 전개되며, 우리 논 이 대화들을 통하여 우파니샤드 哲人둘이 세계의 궁극적 實在를 추구하는 哲學的 情熱과 永遠한 삶을 바라는 宗敎的潟望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에 참가하는 자들은 바라문계 급의 사람들뿐만 아니 라 크샤트리 야나 혹은 심 지 어 슈드라계 급의 출신들과 여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 다. 우파니샤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다양하고 방대한 문 헌으로서, 현재 우파니샤드라는 아름을 지 닌 문헌은 약 150 종 내 지 200 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브라흐마나에 소속 되 어 있는 古典的인 主要 우파니 샤드는 약 13 편으로서 , 時期的으 로 보아 약 B.C 700 년로부터 A.D 200 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 정되며, 따라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들이 발견되고결 코 하나의 일관된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브르 하드아라냐카 Brbadara1_ 1ya ka 우파니 샤드』와 『챤도기 야 Cbandog ya 우 파니샤드』로 대표되는 初期우파니샤드의 中心思想을 考察하기로 하자 .1)
1) P. Deussen 의 推定에 따로면 다음과 감은 것 들이 初期 우과니 샤드에 속한다 : 브로하드아라냐카 Brhadara 1;ty aka( 白야주로 베다 소속) 챤도기 야 Chandog ya (싸마 베 다 소속) 타이 타 리 야 Tait tiriya (Jl뀜 야주르 베 다 소속) 아이 타레 야 A ita re ya( 리그 베 다 소속) 카우시 타키 Kau~it aki (리 그 베 다 소속) 케나 Kena( 싸마 베다 소속) 이상은 年代順으로 열거되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Deussen 의 推測 l 에 지나지 않 는 것이지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The Phil o sop h y of the Up a nis h ads (London, 1906), pp. 22~26 참조.
2 初期 우파니샤드의 哲學 우파니 샤드의 궁극적 인 知識은 브라흐만 Brahman 을 아는 지 식 이
다· 브라호만은 원래 브라흐마나에서 祭祀에 쓰이는 聖스러운 말 혹은 이 말의 聖스러운 힘 등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우파니샤드에 와서는 이 개념이 더욱더 형이상학적으로 발전하여, 祭儀와 關聯된 意味는 거의 없어지고 우주의 궁극적 실 재 내지 힘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이는 모든 現象 界의 根底 또는 核心으로 이해되며, 보이는 다양한 세계의 背後에 있는 어떤 統一的인 質在이다. 萬有가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다시 홉수되게 되는 萬有의 根源이며 歸着地인 것이다. 『챤도기 야 우파니 샤드』의 哲人 웃달라카 Uddalaka 는 브라흐만으로 부터의 世界展開과정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最初에는 이 세계는 둘도 없는 一者인 有 sa t만이 있었다. 어떻게 非 有로부터 有가 생길 수 있겠는가? 이 一者가 多가 되고 싶어서 불 tej a s 을 放出했고 불은 물 a p as 을 방출했고 물은 음식 anna 울 방출했 다. 그 다 음 一者가 이들 셋 안으로 살아 있는 내적 自我 ji va t man 로서 들어가서 그 셋을 섞어서 각각 또 셋을 만들어내어 萬物의 이룹 naman 과 형상 rUp a 을 산출시켰다. 불과 물과 음식의 색깔은 각각 빨강과 하얀색과까만색이 고 이들은 眞理 sa ty a 이고 그들로부터 나온 差別的인 것들은 말 vac 에 의 하여 이 름이 주어 진 변형 v ik ara 에 지 나지 않는다. 그리 고 人間에 들어 와서는 이 세 요소들의 가장 微細한 部分은 各各 마음 manas 과 숨 pr ~a 과 말 꿉 c 이 되었다 .2)
2) Chii nd og ya Up a ni~ a d, VI, 2~6 을 요약한 것 임 .
웃달라카의 이러한 宇宙論的 思辨은 분명히 다양한 만물에 본질 을 이루는 하나의 통일적 實體가 깔려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현상세계의 다양성을세 가지 要素들의 혼합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상키야 Sarhkby a 學派에 의 하여 物質界룰 구성 하는 사트바 satt va , 라자스 raja s , 타마스 tam as 의 三要素說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다. 웃달라카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宇宙論的 사변을 人間에 대한 고찰에 연결시켜 우주와 인 간의 본질이 동일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타이 티 리 야 Tait tiri y a 우파니 샤드』에 서 는 萬物의 母胎와 같 은 브라흐만으로부터 展開되어 나온 현상세계의 存在論的 秩序를 人 間存在룰 중심으로 하여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죽 브라흐만은 人間存在에 있 어 서 다섯 가지 의 @ p a fi ca-kosa 울 가진 自 我 a t man 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제일 낮은 층을 이루는 것은 음식 , 즉 物質로 이 루어 진 annamay a 自 我이 다· 그 위 로는 動植物에 공통된 生命으로 이 루어 진 pr ai:i a may a 自 我, 動物만에 공통된 知登 활동으로 구성된 manomay a 自我 人間만이 소유하고 있는 認識 왈 동으로 된 vij fian amay a 自 我, 그리 고 가장 높고 깊 은 단계 로서 喜 脫 로 이루어진 anandamay a 自我룰 말하고 있다· 이 마지 막의 喜竹t 로 된 自我란 곧 人間의 가장 깊은 곳에 內在하는 브라흐만 自 體 인 것 이다.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과 브라흐만의 顯 現 인 현상세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미와 거미로부터 나온 거미줄, 금과 금으로 만든 여 러 가지 물건들, 불과 불꽃들, 진흙과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 혹은 악기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비유들이다. 이 비유들이 暗 示하고 있는 바는 -과 多의 관계로서, -을 알면 多룰 알 수 있으 며, 一온 불변하는 實 在이며 多는 변화하는 현상세계로서 사실은 단지 이 름과 형 태 namar iip a 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 이 다· 유명 한 샹 카라 Sankara 의 不二論的안 베 단타 Advait a Vedanta 철 학에 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현상세 계 를 단지 우리 의 無知 av i d y a 로 인한 幻術 ma y a 로 보는 見解는 우파니 샤드에 는 아직 분명 히 나타나 있지 는 않으나 암시적으로는 이미 存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슈 베 타슈바타라 sve t asva t ara 』와 같은 後期의 우파니 샤드는 브라흐 만을 인격적 神인 이슈바라 Isvara( 主)로서 파악하며, 이 세계는 마 술사 ma yi n 와 같은 神의 幻術 ma y a 에 의하여 나타나 보여진다고 말 하고 있다. 그러나 다론 한편으로는 雜多한 현상세계가 브라흐만으 로부터 展開되어 나온 것이거나혹은그것의 發 形인 만큼 어디까지나 幻術일 수 없고 오히려 브라흐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一種의 況神論的 思想도 多分히 발견되고 있다· 모든 것이 브라흐
만의 顯 現아기 때문에 브라흐만이 모든 것의 배후에 혹은 그 속에 內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우피니샤드에 는 세계를 브라흐만의 전개로 보는 轉礎說 p ar i namavada 과, 세계는 브라흐만이라는 唯一의 實在를 根操로 하되 단순히 가상적으로 냐 타나 보이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견해, 죽 假現說 v i var t avada 이 둘 다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前者는 베다나 브라흐마나에서 이미 발견되는 宇宙發生論的 cosmog o nic 思想에 기초한 것이며, 後者 는 우파니샤드 特有의 哲學的寄與라고 볼 수 있다. 兩者는 다 宇 宙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實在인 브라흐만과 有限하고 變하는 현상 세계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인 것이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보다도 브라흐만에 대한 宇宙論的인 思辨을 넘어서서 우주의 窮極的인 實在룰 주체적 으로 파악했다는 데 있다. 즉, 우주의 궁극적 실재인 브라흐만은 곧 다름아닌 인간의 실재라는 관점하에 우파니샤드의 哲人들은 實 在探究의 방향을 전환하여 自我의 탐색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이 방 향 전환은 종래의 外向的인 宇宙論的 思辨으로부터 內向的인 人間 의 自己省 察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파니샤드의 불멸의 사상적 공헌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이 전환은 祭祀儀式을 관장하면 서 聖스러운 브라흐만의 힘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한 바라문계급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반발로서 이해될 수 있다. 우파니샤드에 바라 문계급 출신이 아닌 많은 哲人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事 實을 시사하고 있는 것아다. 그들은종래의 바라운계급에 의한 제 사를 매개로 하는 종교생활에 회의를 품고 자기 자신의 영원한 自 我롤 찾음으로써 우주의 窮極的인 質在에 直接的으로 接하고자 하 는 노력울 한 것이다 .3)
3) Deussen 은 特히 K~atr i y a 계 급 가운데 서 우파니 샤드의 秘 죠 的인 只理가 처 움에 전수되 었 다고 생 각한다. The Phil o sop h y of the Up a nis h ads, pp. 16~22 참조.
우파니 샤드는 인간의 참자아몰 아트만 a t man 이 라 불렀 다. 〈아트만〉 이란 문자 그대로 〈自我〉라는 뜻으로, 문제는 무엇이 참으로 인간 의 不 젖 하는 自我몰 描 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 哲人 들의 最 大 關心 事 였 다. 우리 는 이 問題에 對하여 種種의 思辨들을
우파니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예를 돌면 우선 人間存在의 根 接로서 자주 숨 p rana 이 慕論되고 있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숨은 인간의 다른 모든 感礎器官의 活動보다 더 緊要하고 잠시도 停止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은 인간의 精神的機能을 설명 할 수 없다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때로는 숨대신 意根 manas, 意識 vij fiiina , 知 p ra j顔 둥이 인간의 本質的 自我로서 擧論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사변의 頂點 은 아 모든 것이 불충분한 것임을 깨닫고 인간의 참자아란 위에서 말한 육체나 정신적 要素와는 달리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 깔려 있 는 깊은 宜在임을 이해하게 되는 데 있다. 이러한 한층 深化된 思 辨은 소위 自我의 4 가지 狀態에 대한 理論에 잘 나타나 있다. 첫 째는 우리가 깨어 있는 狀態에서의 自我이다. 죽, 우리의 감각기관 이 外界와의 接觸에 의하여 活動하고 있는 狀態이다. 이 상태에서 는 自我는 우리의 몸과 同一視되며 자아가 가장 !였薇된 상태이다. 둘째는 꿈을 꾸는 狀態로서, 이때에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몸은 쉬 고 있지 만 우리 의 마음, 죽 內的 感登器官 manas 과 意識은 계 속 活 動하고 있으며 깨어 있을 때의 체험을 材料로 하여 微細한 對象의 세계를 任意로 만들어 내는 상태이다· 여기서도 역시 참자아는 發 見되지 않고 마음이 自我와 混同되고 있는 상태이다· 세번째 自我 의 狀態는 이보다 더 깊은상태로, 꿈도 없는깊은睦眠의 상태이다. 여기서는 어떤 감각기관이나 의식작용도 없고그에 해당하는대상도 사라지게 된다. 죽, 主觀과 客觀의 對立과교섭이 초월되고모든 多 樣性과 制限性이 사라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아주 無意識의 상태를의미하는것은 아니다. 可變的이고特 定한 制限된 의 식 이 아닌 無限한 純粹識 cit만이 밑 바닥에 깊 이 깔려 있는 상태 라고 한다. 『챤도기 야 우파니 샤드』의 웃달라카는 이 깊은 수면의 상태를 곧 自我가 순수하게 그 自體륭 되찾은 完全한 상태로 간주한다. 마치 한마리의 새가 이리처리 ·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 ` 의 보금자리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 .4) 그러나 『만두키 야 MandUk ya 우파니 샤드.!I와 같은 후기 우파니 샤드에서는 ·
4) C/ziin d og ya Up a ni~ a d, VI, 8. l~2; VIII, 11.1.
더 나아가서 제 4 의 t ur i y a 상태 를 完全한 상태 로 말하고 있 다• 이 4 번째 自我 의 상태는 喜 脫 ananda 의 상태로서, 세번째의 깊은수면 의 상태와 같이 主 • 客 의 對 立이 초월되며, 모든 有限한 정신적 활 동이 그친 상태이다. 이 상태야말로 自我가 아무런 訪 害 없이 순수 하 게 드러나는 지극한 희열의 상태인 것이다. 自我가 特定한 대상 이 없 이 純粹意識 으로서 스스로 밝게 svay am p ra kasa 存在하는 狀態 이다. 이 상태는 보통의 經驗 으로서는 주어지지 않고 요가와 같은 정산적 훈련을 통하여 주어지는 神秘的 體驗 의 世界이다. 우파니 샤드의 哲人 야즈나발키 야 Ya jii ava!k ya 에 의 하면 자아는 인간의 모 든 인식행위나 정신적 활 동의 背後에서 항시 그것을 지켜보는 證人 sak~ i n 과 같은 絶對 的 主 體 로서 결코 우리 의 認識의 대 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認 識 이요, 다른모든 認識의 主 體 로서 그 자체는 결코 認 識 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直 觀에 依하여 自明한 것으로밖에 알려질 수 없는 實 在이다. 따라서 설명이나 定 義 도 不可能하다. 오로지 否定的 方法으로, 〈무엇도 아 니고 무엇도 아니다 ne ti -ne ti〉라는 식으로밖에는 이야기될 수 없는 性質의 것 임 을 야즈나발캬 Yaj ii aval ky a 는 强調하고 있 다. 이 自我는 어떤 差別性이나 個別性을 容納하지 않는, 모든 人間 에게 共通된 自我이다. 웃달라카는 그의 아들 슈베타겟두 Sveta k etu 에게 이 眞 理를 여러 가지 비유로써 가르치고 있다. 꿀이 여러 나 무들로부터 채취되지만 하나의 본질이듯이, 강물들이 東에서 오든 西에서 오든 하나의 바닷물을 이루듯이, 아트만에는 아무런 個別的 差別性이 없 다는 것 이 다. 분만 아니 라 이 아트만은 다름아닌 브라흐 만으로서 人間뿐만 아니라 모든 存在의 共同된 本質울 이루는 것이 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물의 어느 부분을 맛보나소금의 맛아 있듯 이 아트만은 存在하는 모든 것 에 過在하는 共通된 本質이 라는 것 이 다. 人間을 포함한 모든 世界는 하나의 궁극적 實 在에 참여 하고 있으며 브라흐만은 宇宙의 아트만이요, 아트만은 인간에 內在하는 브라흐만 인 것이다. 바로 이 梵我一如의 眞 理를 깨닫는 것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최 고의 知識 jii ana 인 것 이 다. 〈네 가 그것 이 다 tad tva m asi> , 혹은 〈내 가 브라만이 다 aham brahma asm i〉라는 우파니 샤드의 유
명한 구절들은 이 眞理룰 말해 주는 것이다. 베다나 브라흐마나 시 대에 있어서도 이미 人間을 小宇宙로 보는 견해가 종종 발견되지 만, 우파니샤드에 와서 이 사상은 더욱 철학적으로 昇華되어 大宇 宙의 質在가 바로 다름아닌 小宇宙로서의 人間의 實在 로 抱撰되는 것이다· 브라흐만이 이렇게 人間에 있어서主 體 的으로파악된結 果, 브라흐만의 본성 은 不 變 하는 存在, 純粹 識 , 喜 脫 ananda 로서 파악되 게 되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본질은 無限하고永遠한우주의 본질과 同一視된 것이다. 자기가 곧 브라흐만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욕망과 두 려움에서부터 해방된다. 왜냐하면 자기자신 이외에 따로이 원하거 나 두려워할 다른 아무 대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사람은 모든 業 karma 으로부터 자유로와지며 死後에는 다시 還生하는 일이 없이 브라흐만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삶은 물론 어떤 個人的인 삶의 존속으로 간 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解脫이란 결국 現世에서 이미 자신에 대 한 올바론 통찰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生解脫 .fi vanmuk ti의 사상을 우리 는 이 미 우파니 샤드에 서 찾아볼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리그 베다』나 브라흐마나의 전통 적 인 宇宙論的 사유에 따라서 解脫을 死後에 神들의 길 deva yana 을 따라서 브라호만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3 中後期 우파니샤드의 哲學 이상에서 우리는 初期 우파니샤드의 주요 사상을 대략 살펴보았 댜 이 계 는 『카타 우파니 샤드 Kath a U p an i ~ad 』, 『슈베 타슈바타라 우 파니샤드 Sveta s vata r a U pan i햏 d』 등과 같은 中期 우파니사드의 사상 을 검토해 본다 .5) 이들 中期 우파니샤드는 대체로 B.C 500 년에 서 B.C 200 년경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서, 형식상으로 볼 때 散文
5) 中期에 속하는 우파니샤드로는 이 둘 이외에도 이샤 (Isa), 문다카 (Mu i:ig aka) 等 이 있다. Mutz
대신 주로 韻文으로 씌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부피에 있어서 『브르하드아라냐카』 등과 같은 것에 비하면 훨씬 짧고 내용이 비교 적 간단하다는 特色이 있다. 思想的으로는 初期 우파니샤드에서 아 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브라흐마나의 祭祀主義的 宇宙論的 思辨 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카타 우파니샤드』에 있어서 철학적으 로 새 롭고 중요한 것 은 상키 야 Samkh y a 나 요가 Yo g a 철 학의 根源的 思想이 담겨 져 있 다는 사실 이 다. 『카타 우파니 샤느』는 아트만을 마 차의 주인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마차이고, 우리의 知性 buddh i은 마차를 모는 者, 마음 manas 은 고삐 , 감각기 관 i ndr y a 은 말 들, 그리고 감각기관의 대상' v i~y a 은 말이 달리는 길에 비유되고 있 다. 智慧있는者는항시 마음의 고삐를재어하고, 감각기관의 말을 잘 몰아서 목적지에 도달하여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지 만, 無知한 자는 그 반대로 생각과 감각기관에 이끌리어 輪廻의 世 界에 轉 生하게 된다는 것 이 다. 여 기 서 〈制御한다〉는 말은 요가 yog a 와 같은 語源의 맡 yu j로서 해탈을 위한 實賤的 行爲의 核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方法과 동시에 이를 밀받침해 주는 형이상학적 원리들에 대한 思辨도 『카타 우파니샤드』에 전개되고 있다. 세계 전체를 점차적으로 높은 存在論的 원리에 따라 해석하 여 요가라는 정신동일의 훈련을 통하여 가장 높은 실재에 接하도록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감각기관보다는 대상 세 계, 대상세계보다는 意根 manas, 意根보다는 知性 buddhi, 知性보다 는 大我 mahat- a tm an, 大我보다는 未顯現 avy a kta 그리 고 未顯現보 다는 精神 p uru!}a 이 더 높은 실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사상온 나중에 상키야철학에서 하나의 정돈된 세계轉變의 理論 으로 定立되게 되는 것으로서, 상세한 것은 후에 검토키로 한다·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中期 우파니샤드에는 아직도 精神 p uru~ 과 物質 p rakr ti의 二元論的인 세계관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精神은 物質보다 높은, 그러나 그것과 存在論 的으로 同一線上에 있는 어떤 實在로서, 神 혹은 브라흐만으로 이 해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無神論的 二元論의 사상은 우파 니샤드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中期 우파니 샤드의 또 하나의 중요한 文 t값 은 『슈베 라슈바타라 우 과니 샤드』이 다· 『카타 우파니 샤드』보다 좀더 나중의 것 으로, B. C 2~3 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우파니샤드에는 요가의 質錢에 관하여 『카타 우파니샤드』보다도 더욱더 詳 細한 說明 이 발견된다. 이를테면 요가를 행하는 場 所, 正 座 의 자세, 호흡의 조절, 요가의 실습에 따른 種種의 超自然的 能力 등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요가의 궁극적 目標는 神의 認識에 있으며 神의 인식은 個人의 영 혼들을 物質世界 p rakr ti의 속박으로부터 해 방시 킨 다고 한다. 神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唯一者로서, 萬有를 創造하고 그 안에 內在하 며 마지 막에는 萬有를 다시 회수하는 大主宰 者 Mahesvara 이 다. 우리 는 그의 恩籠 p rasada 에 의 해 神과 그의 偉大함을 보며 그 를 信愛 bhak ti하는 자는 진 리 를 알 수 있 다고 한다. 본래 初期 우파니샤드에는 브라흐만이 대체로 非人格的인 形而 上學的 實在로 이해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온 세계를 지배하 는 人格神으로 간주되고 있다. 特히 그를 베다의 神 가운데 하나 인 루드라 Rudra 로 부르고 있으며 이 루드라神은 나중에 쉬바 Siv a 神과 同一視되는 神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슈베 타슈바타라』의 강한 唯一神的 사상과 信愛 bhak ti의 사상은 서 력 기 원전 3~4 세기경부터 大衆의 信仰운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쉬바 神과 비슈누神의 숭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향 은 大敍 事詩 『마하바라타 Mahabhara t a 』에 와서 더욱더 본격적인 자 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슈베타슈바타라 우파니샤드』의 사상 가운데서 또 한 가지 注目 할 만한 것은 神과 物質 세계와의 關係에 있어서 神울幻術師 ma yi n 로, 物質世界 p ra lqti를 그에 의하여 조작된 幻術 ma y a 로 비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영혼은 이 幻術에 홀려서 붙들려 있는 존재로 간주 하고 있다. 나중에 버1 단타 Ved 료 n t a 哲學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인 〈마야 ma y a 〉라는 말이 여기에 비로소 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神과 個人靈魂과 物質世界와의 三角關係는 후세의 有 神論的 諸哲學體系의 根本을 이 루는 문제 인 것 이 다. 中期 우파니샤드의 人格的인 브라흐만의 이해와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점 은 『카타』와 『문다카 Mui:i< ;la ka 우파니 샤드』에 나타나 있 는 아트만의 啓示의 思想이다. 죽 아트만은 어떤 가르침이나 知的 인 能力에 의하여 알려질 수 없는 實在로서 자기가 선택한 자에게 만 스스로폴 드러 낸다고 하는 사상이 다. 6)
6) Kt ha Up an i$ a d I, 2. 23; Mu~< fa ka Up an i$ a d III, 1, 3.
지 금까지 『카타』나 『슈베 타슈바타라』 등과 같은 中期 우파니 샤 드 思想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거니와 이들보다도 더 늦게 산출된 一 群의 後期 우파니 샤드들도 있 다. 『프라슈나 Prasna 』, 『마이 트리 . Ma it r i』, 『만두키 야 Ma i:i<;l uk y a 』와 같은 우파니 샤드들이 이 에 속하며 대 략 B.C 200 에서 A.D 200 년 사이예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 서는 『마이트리 우파니샤드』의 思想만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마이 트리 우파니 샤드』에 는 대 체 로 『카타 우파니 샤드』 등에 나타 나 있는 상키야철학의 씨가 더욱더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발달되어 있 다. 예 를 들면 상키 야 학파에 서 말하는 個人我 p uru~a 의 개 념 이 明確히 정 립 되 어 物質 pra kp :i, p radhana 로부터 成立된 元素我 bh iit a t man 와 확실히 구별되고 있으며, 輪廻의 主體로서의 細身 : li n g asar i ra 의 개념도 발견된다· 또한 萬有룰 構成하고 있는 三要素 (satt va , raja s , t amas) 의 理論도 發見되며, 요가 철학의 根本이 되는 요가 修行의 八支說에 가깝게 그 중의 6 단계가 이미 언급되어 있 다. 이상에서 고찰한 中後期의 우파니샤드들을 동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상키야哲學은 아마도 體系的인 學派 가운데서 가 장 오랜 歷史를 지닌 哲學的思惟라는 점이다. 그것은 해탈의 宗 敎로서 實賤的인 要素가 强한 佛敎의 影響 아래 이에 相應할 만한 解脫의 方法과 理論을 明確하게 제 시 할 必要를 느낀 바라문 思想家 둘의 對應策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참고문현 Deussen, P., The Plzil o sop 1,y of tlze Up an is h ads. Trans. by A. S. Geden from German. London, 1906.
, tra ns., Sechzig Up a nis a ds des Veda. Leip z ig , 1897. Hume, R. E., tra ns., Thir tee n Prin c ip a l Up a nis h ads. London, 1931 . ~eit h~ A. B., The Relig ion aud Plzil o sop h y of the Veda aud Up a ni- shads. Cambrid ge , Mass., 1925. Muller, M., tra ns., The Up an is h ads, SBE I, XV. Ox for d, 187f1 . 1884. Oldenberg, H. , Di e Lelzre der Up a nis l zaden und die A11fi i.11g e der Buddlzis m us. Gott ing e n, 1915. Radbakri sb nan, S., tra ns., The Princ ipa l Up a ni$ a ds. London, 1953. Ranade, R. D. , A constr u cti ve survey of Up a nis h adic Phil o sop h y . Poona, 1926. Ruben, W., Die Phil o sop he n der Up an is h aden. Bern, 1947.
제 4 장 非婆羅門系 哲學의 發興 1 歷史的 背 景 印度의 西北部로부터 들어와서 인더스江과 참나江 사이에 자리를 잡고 바라문계급의 主 導 下에 발전했던 아리안族의 베다文化는 기 윈전 6~7 세기경부터는 東쪽으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 시 기에는 鐵 器文化의 수입으로 여태껏 밀립지대였던 곳이 개간되어 農 作地가 확대되고 생활이 윤택해집에 따라 갠지즈江의 中流以東에는 여러 곳에 商工業을 中心으로 한 都市文化가 건설되게 되었다. 이 와 더불어 종래에 村落과 氏族的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돼 왔던 바라문敎의 地位도 자연히 혼들리게 되었다. 더우기 아리안族의 東 潮i에 따라서 原住民과의 人 種 的 혼합도 생기게 되어 傳統的 바라문 교의 약화는 더한층 加速化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 난 것이 바라문의 사회적 特權이나 베다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佛敎나 챠이나敎와 같은 새로운 自由思想的 운동들이었다. 이 時期는 또한 印度가 정치적으로도 큰 變 化를 겪는 때였다. 종 래의 群小部族國家둘은 마가다 Ma g adha 나 코살라 Kosala 와 같은 강 대한 君主國家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정복당하였으며 이에 수반하는 정치적 • 사회적 혼란과 不安이 극심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都 市文化의 發達에 따라서 安定된 種族的 유대관계를 잃은 도시의 商 工人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이 주어진 개인적 自由와 세속적 향락의
기회를 누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人生의 無常함 과 無意味 함 을 더욱 切 꿨' 히 느끼게 되기도 한 것이다. 佛 敎 와 쟈이나 敎 는 무 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都市商工人 들 의 새로운 宗敎 的 欲求 에 부% 하여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을 잡게 된 종교인 것이다. 佛敎 와 쟈이나 敎 는 물론 이러한 격변하는 時 代에 發生 한 대표적 엔 자유 思想的 종교운동이었다. 그러나우리는 그 밖에도 많 은유사 한 운동들이 있었음을 佛 敎 나 쟈이나교의 文獻들 에서 찾 아볼 수 있 댜 이들 자유사상운동들은 종래의 바라문들과는 달리 沙 門 §ramana 이라는 새로운 형의 종교지도자들울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 었 다. 沙 門이 란 一定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村 落 이 나 都市에 遊行 하면서 乞食에 의해 生計를 유지하면서 修 行과 布 敎 에 전념하는 出 家者 둘 이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자연히 그들의 敎 說울 따르고실천하는 T 리들에 의하여 僧 伽 sam g ha 라는 生活共同 體 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 들 공동체들은 사회적 계급적 신분의 차별없이 누구나 다참여할수 있는 開放的인 성격을 띤 집단이었다. 佛 敎 나 쟈이 나 敎 룰 제외하고는 이들 群 小 宗 敎 운동들의 思 想 은 재 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으나 佛 敎 의 經 典들을 통 하여 우리는 그들 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哲 學 的思惟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佛 敎 의 經典에는 소위 六師外道라 하여 佛陀 당시에 그의 가르침과 어 긋나는 여섯 가지의 思想둘이 유행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1 중에서 챠이나 敎 는 나중에 항을 달리하여 고찰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의 敎說둘을 먼처 간략히 소개 한다. 2 六師外道 팔리 Pali 語로 된 小乘 經 典의 하나인 『沙門 果經 Sii m afi fiap h ala- su tt an t a 』에 의하면 1) 첫째, 푸라나 카사파 Pi ira Y) a Kassa p a 라는 사람
1) Di al og u es of the B11ddha, Part I, Sacred Books of The East, ed. by F. Max Mi llier , Vol, II. 淡譯 阿 含經 에도 이 經 이 번 역 되 어 있 다. 『大正 新修大藏經』 1, pp. l
는 1'又 生 , 倫益 , 浮逸 , 妄 語 等의 행동을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하 : 도 록 가르쳐도 惡이 아니며 惡한 業報를 받지 않는다는 業 의 法則 을 否定 하는 無道德說(說無作 ak i riy a~ada) 을 주장했다고 한다. 마칼리 고살라 Makkhali Gosala 라는 者는 인 간의 道德的 그리 고 人 格的 상태에는 아무런 原因아나 理由가 없으며 人間을 포함한 모든 衆生의 상태는 단지 運命 n iy a ti과 그들이 속한 種 samg a ti , 그리고. 그 들의 天性 bhava 에 의 하여 決定 되 기 때 문에 自 身의 行爲 냐 勢力 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運命論 혹은 決定論을 주장했다. 그는 本 性論的 인 svabh 료 vavada 決定論者 로서 人間은 自 身의 現在와 未來에 대하여 아무런 責任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輸廻 와 業 을 認定했 지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꼭 같이 一 定 기간 동안 生死의 世界에서 定해진 甄 의 苦痛과 즐거움을 맛보기 마련이며 아무도 아것에 영향을 주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 이다. 해탈이란 이 주어전 기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그때에야 비 로소 苦의 終息 이 가능한 것이다. 그는 運命과 天性의 절대적인 支 配를 믿는 철처한 決 定 論者 이나 同時에 이러한 요소들 이외에는 人 間의 상황에 대하여 다른 아무런 原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無 因論者 ahe t uvad i n 이 기 도 한 것 이 다.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을 따르 는 者 둘을 邪命派 _Aji v i ka 라고 부른다. 그의 견해 나 경 력 은 챠이 나 經典 에도 전하여지고 있으며, 쟈이나교의 祖師인 니간타 나타풋다 Ni ga i;i tha Na t a p u tt a 와 一時 修 行을 같이 한 일도 있었다. 邪命派는 제법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 은 혼적이 남아 있다 .2)
2) A. L. Basham, Hi st o r y and Doctr i n e s of the .Ajivik a s: a vanis h ed India ,s Reli gion (London, 1951) 참조.
세 번 째 의 外道로서 아지 타 케 사캄발라 Aj ita Kesakambala 라는 자 는 感登的 唯物論을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地, 水,火, 風 의 四大로부터 생겼으며 현명한자나어리석은자나누구든지 죽으면 身 體 가 파멸 되 고 아무것 도 남는 것 이 없 다는 斷滅論 ucchedavada 울 주 장했다. 그는 감각만이 인식의 唯一한 원천이며 業 의 法則울부인하 는 無業論 na tt h i kavada( 說無 業 )을 주장하고 死後의 世界를 否定했다. 네 번째로, 파쿠다 카차야나 Pakudha Kacca y ana 는 世界는 地, 水,
火, 風, 苦, 樂, 命我의 不俊하고 영원한 일곱 요소로 구성되어 있· ' 으며, 行爲의 主體가 되는 存在란 없다고 하는 물질주의적이며 無 人格的인 世界觀을 說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리한 칼로 남의 머리를 둘로 쪼개도 사실 아무도 그의 생명을 앗아간 자가 없 으며 단지 칼이 일곱 가지 요소들의 톰 사이로 침두하여 들어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와 사건을 철처히 非人格的인 과정으. 로 說明하는 세계관인 것이다. 다섯번째로 산자야 벨라티풋타 Saii jay a Eela tt h ip u tt a 라는 者는 來世 · 와 業報에 대하여 認識的 懷疑論울 주장했다. 죽 業이 란 것이 존재 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그렇다고도 안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 라고, 그렇지 않지 않은 것도 아니 라고 대 답한다는 것 이 다. 마가다의 수도인 王舍城에서 살았으며 佛陀의 유명한 제자사리풋타 Sar ip u tt a 와 목갈라나 Mo gg allana 도 처음에는 그의 재자였다고 한다. 以上의 5 가지 理論돌에서 우리가 特別히 유의해야 할 점은 그들 이 대체로 말해서 物質主義的인 人間競을지녔고우파니샤드에서 말 하는 人間의 깊은 靈的인 自我 즉 아트만이나 宇宙의 窮極的 實在 인 브라흐만 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死後의 世界에 대해서도 懷疑的이고 심지어는 道德的 價値 내지 法則마저 否認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바라문주의 에 의하여 정립된 사회윤리질서와 종교사상에 대한 반발 혹은 비판 ·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考察하겠지만 佛陀의 敎說은 한편으로는 이런 사 · 상들과 類룰 같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懷疑主義나 形 而上學的 斷滅論과 같은 결론에는 빠 :;..>r 않는 所謂 中道的인 · 立場 을 표방한 가르침이었다. 이러한 批判的 • 自由主義的 思想의 전통 을 후세에 좀더 철학적으로 體系化하여 정리한 學派가 다름 아닌 챠 · 르바카 Carvaka 학파인 것이 다. 3 챠르바카의 哲學 〈챠르바카 Carvaka> 란 말의 원 래 의 미 는 분명 치 않으나 여 하든-
챠르바카는 인도철학사에서 唯物論과 恨疑主義 밋 享樂主義륭 代表 하는 學派로 알려져 있으며, 佛敎나 쟈이나敎 동을 포함한 다른 모 든 학파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3) 세상 사람들의 천박 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따르는 철학이라 하여 順世派 Lo 區y a t a 라고도 불린다. 이 학파의 주장하는 바는 그 학파 자체의 문헌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비판자들의 著 書 를 동하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客親的 正當性을 가지고 있다고 0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哲 學的 立場을 내세웠읍을 印度哲學史家들은 말하고 있다 .4)
3) 一說에 의 하면 〈챠르바카〉는 唯物論的 哲學운 가르친 어 떤 哲學者의 이 름이 라 하 고, 어떤 견해에 의하면 유물론자들이 〈먹고, 마시고, 중기라〉(〈 carv 〉 즉 〈먹는 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는 철학을 가르치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몽이라고 한다. 이 밖에 다른 견해들도 있음. 4) 佛敎나 챠이 나교의 經典융 除外하고 順世派의 哲學에 대 하여 다음과 감은 主要 資料둘이 남아 있 다 : 8 세 기 의 챠이 나교의 學者 Hari bh adra S ii r i가 편찬한 『六派 哲學菜成 Sa g darsanasamucca y a 』; 14 세기의 베단다 철학자 마다바 Madhava 의 J全a哲y a學r a網si 要 B hSaa trl av 의ad a『rs眞a理na災s難am의 g ra王h a T』;a tt7 v 세o p기ap의 l av順as世 i m派h의a 』 · 哲學者 챠야라쉬 밧타
® 地 • 水 • 火 • 風이 萬物을 構成하는 要素둘이 다. ® 몸과 감각기관과 감각의 대상들은 이 四要素둘의 여러 가지 相 異한 結合에 의한 結果이다. ® 意識이란 物質로부터 생긴 것이다. 마치 발효된 누룩으로부터 술의 취하는 성질이 생기는 것과 같다. ® 靈魂이 란 意識이 있는 몸에 지 나지 않는다. ® 享樂만이 人生의 유일한 目的이 다. ® 죽음만이 解放이다. 챠르바카학파는 인식론에 있어서 直接的 知~ p ra ty ak~a 만이 라당 한 인식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여 인도철학의 諸學派들이 대부분 인 정하고 있는 推論 anumana 의 타당성을 부정한다. 推論이란 직접적 인 경험에 의하여 알려진 것에서부터 모르는것을 알려는시도로서, 거기에는 確實性아 없다고 한다. 演線的 推論은 결론이 아직도 立 證되지 않은 大前提로부터 推理되어 나오기 때문에 先決問題未解決 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大前提, 예를 들어
〈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혹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 는 一般的 命題룰 옳은 것으로 알 수 있는가이다. 챠르바카에 의하면 普週的인 陳述의 타당성은 우리의 知 1 장 이 경험한 법위내에서는 타 당하다고 한다. 그러 나 아무도 〈연기 〉와 〈불〉 사이 의 관계 를 모든 경우에서 다 관찰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歸納 的 推理에 의한 결론에는 비약이 있다는 것 이다. 大前提 의 核 心은 두 현상간의 必然的이고 普通的 인 廟延關係 vy a pti가 5) 成立되 어 야 하는 것인데 귀납적 추리는 이러한 관계를 확립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불과 연기 사이의 因果關係롤 論하는 것도 소용없다. 왜냐 하면 바로 이 因果관계를 아는 것도 귀납적 추리 이며 이 추리 自盟 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他人의 證 言 에 의하 여 이 보편적 관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他人의 증언의 타당 성 自 睦 가 추리에 의하여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챠르바 카 哲學의 推論에 대한 회의는 西洋哲學史에서 잘 알려진 흉 Hume 의 귀납적 추리와 因果 律 에 대한 회의론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5) 나중에 냐야 Ny a ya 哲學융 소개할 때 설명됩.
챠르바카는 또한 權威있는 사람들의 證言 sabda 도 認識 의 타당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왜 그것을 믿는가를 밝힌다. 그러자면 자연히 推論이 들어 가게 마련이며, 이 推論의 타당성은 이미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다 론한편, 직접 말을들어서 무엇을 알경우에는그것은직접적인지 각으로 간주하여 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베다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이러한 견해에서 두말깥 여지가 없다. 챠르바카의 형이상학은 이와 같은 인식론의 당연한결과이다. 즉, 이 학파는 직접적 지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존재들의 實在룰 모두 否認한다. 神의 존재, 영혼의 존재, 그리고 業 의 法則, 生前이 나 死後의 存在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챠르바카는 주장하기를 이 런 것들은 司祭階級이 無知한 사람들을 속여 자기들의 이익을 追求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낸 이론들이라고한다. 또한챠르바카는이 러한 세계관에 들어맞는 倫理觀을 서슴없이 정직하게 편다. 人生 의 最高의 目標는 이 세상에서 肉體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괘
락을 최대한으로 즐기는 데 있다고 한다. 이 이상 다른 道德의 法 則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고통을 完全히 克服하려는 解 脫의 理想은 불가능한 것이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쾌 락과 고통은 반드시 섞여지게 마련이며,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쾌락과 고통의 彼岸의 세계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껍데기 때문에 알맹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이 追求 해 야 할 네 가지 目 標, pu ru9arth a 즉, W,~ kama, 富 art ha , 義務 dharma, 解脫 mok 우 a 가운데서 챠르바카는 첫번째인 欲望만을 인정 한다· 富 는 어디까지나 欲望울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욕망만 을 최고의 價値로 간주한다. 챠르바카 철학은 놀랍게도 현대적인 면을 많이 지닌 과격한 사상 으로서, 古代 인도인의 思惟의 自由플 입증해 주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여하튼 인도의 正統哲學學派들이 앞을 다무어 이 챠르바카 의 견해를 論破하려고 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 의 제기와 해결에 있어서 너무나 과감하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 목 학파로서 는 오래 존속하지 않았지 만 챠르바카는 다른 학파의 철 학적 사유를 항시 자극해 왔다는 데 있어서 印度思想史上의 특수한 기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동 인도철학은 이 챠르바카가 제기한 문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대답했 는가에 그 死活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原始 쟈이나敎의 思想 佛陀와 同時代에 쟈이 나敎의 創始者 바르다마나 Vardhamana 가 있 었다· 그는 인도의 복부 바이샬리市 부근에서 B.C 549 年에 한귀족 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30 세에 出家하여 苦行과 膜想에 2 년간 전념한 후,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苦行者로서 12 년간 심 한 苦行의 생 활을 하였 다. 드디 어 한 여 름 밤에 完全知 kevala-ji ian a 를 얻 어 獨存位 ka i val y a 에 도달하였 다. 그 후로는 〈마하바 라 Ma 迫 vlra>, 죽 〈偉大한 英雄〉, 혹은 지 나 Jina , 죽 〈勝者〉라는 稱號를 얻 어 여 러 곳을 遊行하며 布敎生活울 하다가 72 세를 一期로 하여 과
트나 부근에서 생을 마쳤다. 대체로 佛 F' t와 매우 비슷한 生융 보냈 으나 苦行을 철처히 했다는 점에서 큰 差異룰 보인다. 챠이나敎의 傳統에 의할 것 같으면, 마하비라는 그의 이전에 있 었 던 많은 지 나들 (〈여 울을 만드는 자〉라는 뜻의 T i r t ha il. kara 라 불리 는 사 람들)의 후계자로서 그는 제 24 祖에 해당한다. 이들 마하비라 이전의 지나들은 모두 전설적인 존재들로 看敬된다. 단지 제 23 祖인 파르슈 바 Parsva 는 대략 기원전 8 세기 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간 주되며, 그는 4 個條의 修行上의 계율을 가르쳤다고 한다. 죽 殺 生 • 倫盜 • 浮行 • 妄語을 금했다고 한다. 마하비 라는 거기에 소유를 금하는 5 번째의 규칙을 더 하여 소위 五大 :tJ mahavra t a 라는 쟈이 나敎의 근본 윤리강령을 계정하게 된 것이다. 마하비라는 그가 생존했을 때 이미 有力한 敎團울 형성하였으나, 傳說에 의하면 그가 죽은 후 교단은 여러 번 분열을 거듭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白衣派 Sve t ambara 와 空衣派 Dig ambara 의 분열은 유명 하 다. 시력기원전 4 세기 말경 챤드라굽타 Ca n_ dra gupt a 왕 때의 일로서, 마가다지 방에 기 근이 생 기 어 계 6 대 敎團長 바드라바후 Bhadrabahu 는 일부의 수도승과 같이 갠지스유역으로부터 데칸지방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후에 돌아와 보니 그 지방에 남아 있던 스물라바드라 S t h iil abhadra 를 우두머 리 로 한 승려 들이 독자적 으로 聖典의 편 찬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규범에 있어서 타락상을 보였다고 한다. 죽, 흰 옷을 몸에 걸치고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 오라기의 실도 몸에 걸치지 않는 空衣派와 흰 옷을 입는 白衣派로 敎團이 분 열되게 되었다고 한다 .6) 여하튼 백의파나 공의과 모두 바드라바후 이후로는 바르다마나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聖典에 관한 완전한 지 식이 散逸되게 되었다고 한다. 바드라바후가 죽자 백의과의 지도자 스물라바드라는 파탈리 푸트라 Pa t a lip u t ra 에 서 큰 結集울 열 어 聖典 을 12 部門 an g a 으로 再編成하고 백 의 파들에 의 하여 받아들여 졌 다고 한다. 그러나 공의과는 聖典이 全滅되었다고 주장하여 그들 스스로
6) 비판적 연구에 의하면 이 분열은 A.D. 1 세기말겅에야 비로소 最終 化된 것으로 간주된다. 兩派의 敎理上의 차이는 사실 상 거의 없다. 그리 고 空衣派의 수도승들 도 나중에 사람둘 앞에서는 옷을 입었다.
가 만든 代替의 經典울 使用하게 되었다. 白衣派는 서력기원 5~6 세 기에 발라비 Valabh i에서 다시 結集을 하여 그들의 經典을 最終的으 로 定하고 成文化하였 다. 이 챠이 나敎의 聖典은 半마가디 語 Ardha- ma gad i라는 一種의 俗語로 씌 어 져 있으며 마하비 라 이 후 거 의 1000 年 후에 편찬되었으므로 순수한 마하비라의 가르침만을 전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후세의 제계화된 챠이나敎理 書 둘의 사상을제외 하면 대 략 다음과 같은 원시 쟈이 나교의 가르침을 서술할 수 있다.7)
7) 이 方法은 大體로 Frauwallner 문 따몬 것 임 . .::z.의 Geschic h t e der ind is c hen Phil o sop h ie , Vol. I 참조.
佛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하비라의 최대 관심사는 고통스러운 輪廻 의 世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하비라는 윤회의 , 세계에 묶인 人間의 상황을 佛陀와는 달리 이해했다. 죽, 그는 세 계에는 수없이 많은 영원한 命我 ji va 둘이 각각 그들을 내포하고 있 는 물체나 몸둘의 크기에 따라 한계지어진 크기를 가지고 존재한다 고 한다. 命我의 종류도 그들이 거 하고 있는 물체 에 따라 무수히 많 다고한다. 쟈이나교의서1 계관에의하면들이나흙과같은것들도살 아 있는 것으로서 그 안에 命我룹 지니고 있다고 한다. 命我는 우리 의 모든 정신적인 作用둘의 主體이며 行動의 主體이기도하다. 命我 는 본래 적 으로는 다 같으며 , 無限한 知 j a 료na, 見 darsana, 力 vir ya 과 安 sukha 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나, 身 • 語 • 意의 業으로 인하 여 이러한 성품들이 가리워처 있고 서로간에 差異룰 나타낸다고 한 다. 마하비 라는 業울 命我에 달라붙는 일 종의 미 세 한 物質 pu dg a la 로 看敬했으며, 이 물질 때문에 命我가 제 성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 業은 人間의 여러 다른行爲둘의 원인이 되 며, 새로 몸을 받아 여러가지 다른 環境下에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現世에서의 生의 過程을 봉하여 이 前生에 쌓 인 業은 점점 盡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業이 命我로 流入되 게 asrava 된 다. 이 렇 게 流入된 業의 物質 karma-pu dg ala 을 命我에 접착시켜서 그것의 속박 bandha 을 가져오는 것은 四濁 죽, 念 krodha, 漫 mana, ~ ma .ya , 食 lobha 이 라는 激情둘로서 이 들 을 〈카사야 ka~ y a 〉(끈적끈적한 접착재라는 뜻)라 한다. 다시 말하면,
命我가 격정의 자극을 받아 業을 짓게 되면 이 業은 어떤 물질 의 형 태로 命我에 둘러붙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命我는 業身 karma-sar i ra 이 라는 業 의 물질 로 구성 된 미 세 한 몸과 더 불어 輪廻룰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狀態로부터의 解脫은 어떻게 하여 야 가능한가? 물론 命我가 業 으로부터 자유로와져 야만 한다. 그러 기 위 하여 는 우 선 더 이상 새로운 業 의 流入이 없도록 追'.iilr samvara 을 해 야 한 다. 그 방법으로는 도덕적 行爲와 감각기관의 活動의 제어를 통 하여 격정과 業을 줄여야 한다. 다음에는 이미 들어와있는 業을消 滅 n i r j a 료해 야 한다. 이 것 을 위 하여 가장 중요한 방법 은 苦行 ta p a s 이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苦行을 통하여 이미 쌓여 있는 業 이 자연 적인 소멸보다도 더 빨리 소멸되어 버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命我 가 業으로부터 淨化되면 다시는 還生하는 일이 없으며, 챠이나敎의 宇宙競에 따라서 우주의 멘 꼭대기로 昇天하여 거기서 영원하고 幸 福한 全知의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 이것이 命我의 해탈인 것이다. 5 原始佛敎思想 원시불교의 철학적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장 완벽하계 전 하여 오는 것 은 팔리 語로 씌 어 진 上座部 Theravad; 傳 統의 經 • 律 • '尙 三藏 T ripit aka 이 다. 그 중에 서 도 佛陀의 說法을 내 용으로 하는 經은 가장 중요한 文獻이다 .8) 付鼎t의 敎說이 口傳 단계를 지나서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B.C. 1 세기 경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랜 口傳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처님 자신이 說했다고보 기 어려운 후세의 여러가지 雜多한 宗敎的 • 哲學的 사상이 많이 混 入되어 傳하게 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진정한 불타 자신의 가르침 을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8) 팔리 어 經典 에 는 經藏 은 다섯 개 의 部渠 n i ka ya 으로 나뉘 어 있 다. 죽, Digh a N i ka y a( 漢譯 長 阿含) Ang u t tar a N i ka y a( 坦一阿含) Majj him a N i ka y a( 中阿節 Khuddaka Ni ka y a Samy utta Ni ka y a ( 罪阿含 )
다· 그러나여러 經둘을통하여 공통적으로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거듭되어 강조되고 있는 사상들을 우리는 대체로 불타 자신에서부 터 연유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예플 들면 四聖諦, 八正道, 五慕, 十二支緣起, 四念處 등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들을 중십으로 하여 原始佛敎의 思想울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佛陀는 히 말라야 山麗에 있는 조그마한 사키 야 Saky a 族의 王國 의 王子로서 태어났다고 한다. 당시의 일반적인 정치적 추세에 따 라 사키 야王國도 인근의 강대 국인 코살라 Kosala 國에 의 하여 압박을 당하다가 결국 供合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佛陀 의 姓은 고타마 Go t ama 였고 그의 이 름은 싯 달타 S i ddh 료 r t ha 였 다. 〈佛陀〉란 지나 Ji na 와 마찬가지로 修行 後에 얻어진 칭호이다. 그리 하여 그는 고타마 佛陀 혹은 釋迎牟尼 Saky a muni, 죽 사키 야族의 聖子라고 불린다• 그는 29 세 때 에 당시 의 沙門들처 럼 出家하여 乞食遊行하면서 종 교적 修行을 했 다. 그는 주로 마가다 Ma g adha 國에 서 6 年間이 나 遊 行하면서 당시의 여러 修行者둘을 만나서 禪定과 苦行을 배우고 실 천했으나 만족을 얻지 못했다. 어느날 그는 가야 Ga y a( 伽耶)라는 곳에 있는 한 菩提樹 밑에서 眼想울 하다가 眞理몰 깨달아 佛陀 Buddha, 즉 〈1 천者〉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나이 35 세 때의 일이었다. 成道 후 그는 前에 苦行을 같이 했던 다섯比丘들에게 說 法울 하기 위 하여 베 나레스 Benares; Bara i:i as i에 있는 鹿野苑(지금의 Sarn 죠t h) 에 가서 최 초의 說法으로서 愛欲과 苦行의 兩極을 피 하여 야 한다는 中道 및 四聖諦와 八正道를 가르쳤다. 이것이 그의 有名한 初轉法輪이다. 佛陀는 그 후 45 년에 걸쳐서 敎化活動을 벌이며 많은歸依者를 얻 었다. 그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마가다國과 코살라國에서 보냈으 며 , 슈라바스티 Sravasti , 라자그르하 Raja g rh a, 바이 샬리 Vais a li 等 의 諸都市둘을 활동우대 로 삼았다. 그는 구시 나라 Kus i nara 라는 곳에 서 80 세를 一期로 하여 生울 마쳤다. 그의 生의 마지막 부분을 자 세 히 전 하여 주고 있는 『大般連藥經 Maha p ar i n i bbana-su tt a 』에 의 하 면 그는 자기 가 죽은 후 敎團은 그가 가르찬 法 dharma 울, 그리 고
各者는 자기 스스로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했다. 그는 최후의 說 法으로 〈모든 有爲法은 滅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지런히 目的을 達 成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佛陀가 成道 후 최초로 鹿野苑에서 說했다고 하는 四聖諦의 첫번 째 진리는 人生의 苦 du l) kha 에 대한 진리 다. 生,老,病, 死가 모 두 苦이며, 싫어하는 者와 만나고 좋아하는 者와 헤어집이 모두 苦 이며,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함도 苦이다. 佛陀는 나아가서 人間存 在률 구성하고 있는 色, 受, 想, 行, 識이라는 五薩, 죽 다섯 가지 의 그룹들이 그 自體가 苦라고 한다. 佛陀에 의하면 人間이란 色 riip a 이 라는 物質的 要 素 둘 dharma, 受 vedana 라는 6 가지 감각기 관 들(眼, 耳, 瓜 舌, 身, 意)과 대상들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정들, 想 sam jfi a 이 라는 같은 방법 으로 해 서 생 기 는 지 각들, 行 sarhskara 이 라는 業윤 일으키는 여 러가지 意志的인 要素들, 그리고 識 vij fian a 이라는 受와 想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意識둘이 한데 묶어진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五羅이 모두 苦인 것은 그들이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항시 變하는 無常 an ity a 한 것이기 때문 이며, 이 無常한 五羅을 取하여 어느 것도 變하지 않는 영원한 自 我라 부를 것이 없다 (ana t man, 無我)고 한다. 우파니샤드 哲學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自我의 개념 은 영원불변하고 무한한 喜脫 ananda 이 되는 것이었다· 佛陀는 이 러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의 人間觀은 우파니샤 드의 哲人들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었다. 죽, 五羅의 어느것도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없으며 인간에게는 五羅의 和合이 외에 따로, 혹은 이 五羅을 소유하는 어떤 不變의 自我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아다. 人間이 란 단지 恒時 變하고 있는 諸法들의 묶 음 자체로서 오로지 現象的인 存在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단 인간 의 存在뿐만 아니 라 세 계 에 존재 하는 모든 事 物은 法 dharma 이 라 고 부르는 더 이상 還元될 수 없는 무수한 存在要素들 fac to r s of ex i s t ence 의 結合으로서 , 이 法둘은 끊임 없 이 生滅을 계 속하고 있 으며, 그 어느것도 常住不 變 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實在 rea lity라는 것은 순간순간 作用하고 사라져 버 리 는 法들뿐이
며 人間과 世界란 이런 法들로 구성된 현상들로서 그 배후에 어떤 불변하는 실체나 본질이 없다는 하나의 현상주의적인 세계관을 불 타는 가르친 것 이 다. 諸法은 苦 • 無常 • 無我의 세 가지 法印 dbarma- lak~ana 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佛陀의 두번째 진리는 이러한 苦에는 苦가 일어나게 되는 原因이 있 다는 集諦 samuda ya 이 다. 죽 다시 태 어 남을 초래 하는 愛欲 trs na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苦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佛陀가 발 견한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서 몇 가지 기본적인 관념들을 내포하 고 있다. 첫째, 苦로서의 人間字在에는 原因이 있다는 생각이다. 苦란 아무 원인도 없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佛陀는 無 因論者 ahe t uva di n 가 아니었다. 둘째, 원인을 가진 것은 生成된 것 이므로 有限한 것이며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原因이 除去되면 結果도 除去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苦로서의 人間存在는 우리가 어 찌할 수 없는 영원한 宿命 n iy a ti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佛 陀는 宿命論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이 偶然論이나 宿命論을 거 부하는 佛陀의 사상은 그의 緣起說 p ra tity asamu tp ada 에 잘 나타나 있다· 緣起說의 일반적인 구조는 A 가 있으면 B 가 있고, A 가 생 기면 B 도 생기고 A 가 없으면 B 가 없고 A 가 滅하면 B 도 滅한다 라는 것이다. 佛陀는 이 眞理폴 苦로서의 人間存在의 원인을 구명하 는 데에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 그가 천명한十二支緣起說인 것이다. 四聖諦에서는 불타는 苦의 원인을 단순히 愛欲이라고 들고 있지만 經典의 다른 여러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12 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生死에 流轉하는 人間存在를 더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無明 av i dy a- 行 sarhskara- 識 vijii ana- 名色 namaru p a- 六入 sag. - a y a t ana- 觸 s p arsa- ► 受 vedan 료一愛 t rsna 一取 u p adana- 有 bbava- 生 j a ti-老死 jar a-maral) a 전통적으로 이 十二支緣起說은 三世(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 간의 流轉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죽 無明과 行은 現世 에 태어나기 이전의 過去世, 識으로부터 有까지는 現世, 그리고 生과 老死는 來世률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佛陀의 이러한
緣起說에 의할 것 같으면 人間存在의 여러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이들 諸法은 우연적으로 無秩序하게 生起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一定한 必然的 規則性 내지 法則性을 가지고 相互聯關 속에서 生滅한다는 것이다· 또한 諸法온 이렇게 相依相資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獨自性울 지니지 못하고 相對的, 條件 的, 그리고 一時的인 存在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諸法이 相依相 資하여 生起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궁극적인 最初의 原因 이 될 수는 없 다. 佛陀의 緣起說은 우파니 샤드의 哲學처 럼 人間과 宇宙의 어 떤 궁극적 인 第一原因 pr im a causa 이 되 는 實在률 인정 하 지 않는 것이다. 오직 無常한 諸法의 相互作用에 의한 生滅만을 얘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無明으로부터 輪廻의 과정이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어디서 시작되든 꼭 같은 樣相으로 生死의 과정 이 되풀이되는 . 것이다· 無明 自體도 條件的으로 發生한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無明으로 生死의 循環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그 것이 보다 根本的인 條件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除去해야만 다른 것 들도 따라서 除去될 수 있기 때문이다. 十二支緣起說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佛 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生死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不變의 自 我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과정을 동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다만 條件的으로 生起하는 諸法의 連續으로서의 人間存在라 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의 生
으로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前後 兩存在의 關係는 같은 것도 아니 며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이 한 연료(五羅이라는) 를 다 태우면 다른 연료로 옮겨가나 그 옮겨진 불은 前의 불과 같 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것이다. 같다고생각하면 無我說에 背反되 는 常住論 sasva t avada 에 빠지 고, 다르다고 하면 人格의 連續性울 無 視하기 때 문에 도덕 적 因果律과 責任을 否定하는 斷滅論 ucchedavada 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 佛陀는 이 두 견해를 배척하고 自己의 立場 을 中道的인 것으로 規定한 것이다. 當時의 우파니샤드的인 人間 觀이 나 唯物論的인 人間觀, 또는 運命 n iy a ti에 의 한 決定論아 나 遇 然에 의한 無決定論을 모두 排后하고 불타는 緣起論에 입각한 人間觀을 說 한 것이다. 그 렇 기 때문에 불타는 緣 起 觀 윤 重視 하여 말하 기 몰 〈緣起룰 본 자는 法 을 보고, 法을 본 자는 緣 起플 본다〉고까 지 말한 것이다. 위에서 考 察 한 十二 支緣 起說에 의할 것 같으면 前生과 後生에 있 어서 한 個人의 人格的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識 (v ijfi ana 혹은 心 citta) 이 라는 것 이 다. 그러 나 이 識 이 라는 것 도 어 디 까지 나 條 件的 으로 成 立되며 항시 변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 sarh t ana 일 뿐이며 어떤 永 久 不 發 의 영혼이나 自我는 아닌 것이다· 흐름이라 하여 識 의 自 己同一性이 完全히 裵失 되는 것은 아니며, 愛 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現世 에 있어서나 혹 은 現世에서 來世로 넘어갈 때나 마찬가지라 한다. 四聖諦의 세번째 진리는 苦가 滅한 상태 n i rodha 가 있다는 진리이 다. 즉, 열 반 ni rva i:i a 이 가능하다는 것 이 다. 후세 에 만들어 진 구별 에 의하면 열반에는 과거의 業 의 결과인 현재의 五 羅 을 그대로지닌 채 로 경 험 하는 有 餘 埋 葉 so p ad hi se~a- ni rva i:i a 과 五 羅 이 해 제 된 후 死後에 주어 지 는 無 餘문 築 이 있 다. 有餘뭄 藥 은 〈生解脫 ji vanmu kti〉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無 漏聖 人阿 羅漢 이 체험하는 완전한 행복과 평 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아라한 arha t이 죽은 후에 어떻 게 되는가이다. 죽 人間에게는 영원불멸의 自我가 없는데도 아라한 은 어떤 형태로 존속하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열반에 들어가는 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佛陀 당시 부터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엿볼 수 있 다. 이 문제 는 佛陀가 대 답하기 를 거 부한 소위 14 無 記 av yfilqta 의 하나였다 .9) 문제는 왜 佛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꺼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 佛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곳에서는 佛陀는 이런 문제는 思辨的 인 것으로서, 자기는 苦의 원인을 알아서 苦룹 제거하려는 실제적
9) 14 無 記 : 世界는 常·(영원)인가 無常 인가, 常이기도 하고 無常이기도 한가, 常도 無 常도 아닌가, 世界는 有逸 ( 有 限)인가 無邊 인가, 有邊 이기도 하고 無邊 이기도한 가, 有 邊도 無邊 도 아닌가, 如 來 는 死後에 存在하는가, 存在하지 않는가, 存在하 지도 存在하지 않지도 않는 것인가, 個人我ji va 는육제와 같은가, 같지 않은 것이 가라는 운재들이었다.
인 관심을 떠난 문제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어 떤 곳에서는 斷常의 二見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답을 하지 않았 다고 밝힌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해탈한 자의 세계, 죽 열반이란 보통 인간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 없 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을 暗示하기도 한다. 죽, 열 반의 세계는 누구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열반에 드는 아라한이 란 마치 연료가 다하여 꺼진 불과 같아서 어떻게 說明하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五羅을 떠나서 別途의 自我가 있어서 열반에 들어가 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란 五羅의 불이 꺼진 아라한에게 주어진 어 떤 상태인 것이다. 네번째 진리로 佛陀는 埋藥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죽 正見 • 正 思 • 正語 • 正業 • 正命 • 正精進 • 正念 • 正定의 八正道이다. 이 8 가 지 修行윤 셋으로 분류하여 戒 (s il a : 正語 • 正業 • 正命), 定 (samadh i : 正念 • 正定 • 正精進) , 慧(p ra jii료 : 正見 • 正思)의 三學으로- 나눌 수 있 다. 佛敎는 궁극적으로 이 三學을 닦아나가는 修行의 宗敎이며, 부 처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이 八正道의 내용을 여러가지로 가르친 것 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苦와 無常과 無我몰 깨닫는 智慧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無明 a vi d ya 이 除去되어야 生死의 循環이 깨어지고 人間存在에 根本的인 變化가 일어나기 때 문이다. * 참고문헌 I 六師外道 및 챠르바카哲學 Basham, A. L. , Hi st o r y and Doctr t 'n e s of AHv ika s: a vanis h ed India n Relig ion . London, 1951 . Daksh ina ranja n , S., A Short Hi st o r y of India n Mate r ia l sm. Calcutt a, 1930. Hoernle, A. F. R., Aj ivik as, Encyc l op ed ia of Reli gion and Et hi c s , Vol I. Ed inb urgh , 1911. Jay a t i lle ke, K. N., Early Buddhis t Theory of Knowledg e . London,
1963. Chatt op a dhy a y a, D., Lokii ya ta : A Stu d y in Ancie n t India n Mate r ia l i sm , Delh i, 1959. Kalup a hana, D. J. , Causali ty: The Centr a l Phil o sop hy of Buddh ism . Honolulu, 1975. Riep e , D. , The Natu r ali sti c Tradit ion in India n Thoug h t. Delh i, 1964. 宇井伯 壽, 『六師外 道 硏究』, 『印 度 哲 學 硏究』 第 二. lI 챠이나 敎 哲 學 Glasenap p, H. v. Der Jai n ism us: Ei ne lndis c he Erlii su ng s reli gion . Berlin , 1925. Jac obi, H., tra ns., Jai n a Sutr a s, SBE, Vol. XXII, XLV. Ox for d, 1884~1895. Jai n i, J., Outl ine s of Jai n i s m . Cambri dg e , 1916. Mehta , M. L., Outl ine s of Jai n a Phil o sop hy . Bang a lore, 1954. Schubrin g , W ., Die Lehre der Jai n a s. Berlin , 1935. Ste v enson, S. T. (Mrs.) , The Heart of Jai n i s m . London, 1915. 패 原 始佛敎哲學 Conze, E. Buddhis m , its E ssence and Develop m ent. 2nd. ed. Oxfor d, 1953. Buddhis t Thoug h t in India . London, 1962. —, ed., Buddhis t Te 챠 Throug h the Ag e s. New York, 019 54. David s , C. A. F. Rhy s, Buddhis m : Its Bi rth and Di sp e r sal. London, 1934. David s , T. W. Rhy s, Buddhis t India . New York, 1903. , Buddhis m , Its Hi st o r y and Lit er atu r e. 2nd ed. London, 1926. , tra ns., Buddhis t Sutt as , SBE, Vol. XI . Ox for d, 1881 . Kalup a hana, D., Buddhis t Phil o sop hy : A Hi st o r ic a l Analys is . Honolulu, 1976. , Causali ty; The Centr a l Phil o sop hy of Buddh ism . Honolulu, 1975. Ke ith, A. B. , Buddhis t Phil o sop hy in India and Ceyl o n. Ox for d,
1923. Lamott e, E. Hi st o i r e du Bouddlzis m e lndie 1 1. Louvain , 1958. O!denberg, H., Buddha, sei1 1 Lebe11, sein e Lehre, sein Genzei1 1 de. Stu tt ga rst, 1914. Di e Lehre der Up a nis h aden u11d die Anf an g e des Buddhis n ms Got ting e n, 1915. Pantl e, G.C., St u die s in the Orig ins of Buddhis m . Allahabad, 1957. Rahula, W. , What the Buddha Taug h t. 2nd ed. New York, 1974. Thomas, E. J., Hi st o ry of Buddhis t Thoug h t. London, 1933. , tra ns., Early Buddhis t Scrip tur es. London, 1935. Warren, H. C., Buddhis m in Tra11slati o11 s. Cambri dg e , . Mass., 1915. 中村元, 『原始佛敎 0 成立』 • 『原始佛敎(l) 思想』
제 5 장 小乘部派佛敎哲學의 發展 1 部派佛敎의 底 1 -Ji j 佛陀의 마지막 날들에 관하여 상세히 전하고 있는 小乘經典의 『大 般 埋 藥經 Maba p ar i n i bbana-su tt a 』에 의할 것 같으면, 佛陀는 그의 入 寂을 앞두고 阿難陀 Ananda 에 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난다여 , 너 희 들 가운데 어 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 이 끝났다. 우리 에게는 더 이상 스승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난다 여,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 주고 계 정 한 法과 律을 나의 死後에 너 희 들의 스승으로 삼아라. 1)
1) T. W. • Rhy s David s , tra ns., Buddhis t S11t tas , SBE, Vol. ).l (Ox for d, 1881) , p. 112.
그러나 문제는 佛陀의 入滅 후 그의 法과 律에 대하여 그의 추종 자들 가운데서 서로 다론 해석과 전승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佛 陀의 生存時에는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 의구심과 논란이 일어 나도 그의 개인적인 높은 人格과 카리스마에 의하여 敎團온 통일과 화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入滅한 후 불교敎團은 그에 비견할 만한 정신적 지도자도 없었고 교단의 조직 또한 교단의 몽 일을 유지할 만한 어떤 敎權的制度를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불교
는 地理的 量 的 成長에 따라 佛陀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다 른 전 통을 전수하게 되었고, 자연히 敎固 의 分 裂 도 不可 避하 게 되었던 것이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 를 해 결 하려고 數次 의 結集會議 몰 했으나 결국 교단은 분열되고 만 것이다. , 제일 처음의 공식적인 교단분열은 佛陀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는 것 을 표방하는 보수파의 長老 둘을 중심 으로 한 上 座部 St ha vir a v a da 와, 敎 理와 僧團 의 規 律 에 있어서 伸 縮性 울 허용하는 進步的 인 大 衆 部 Mahasam ghi ka 와의 분열 이 었 다. 이 분열 의 시 기 는 세 일 론의 南 方佛敎傳統에 의하면 佛 滅 後 약 100 년 後 에 소위 〈十 事 〉 를 둘러싼 戒律해석을 위하여 바이샬리 Va i sa li에서 모인 제 2 차 절 집때 였 다고 하며 선 北方佛敎의 傳 統에 따르면 아쇼카왕의 治世 때 에 마하데 바 Mahadeva 라는 사람이 소위 〈五 事 〉 즉, 아라한 arha t의 권위 몰 格 下시키는 다섯 가지 項目울 주창한 것을 계기로 하여 분열되었다고 한다. 3) 여 하튼 佛滅 후 100 년부터 아쇼카왕의 사이 에 불교교단내 에 분열과 대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王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 하여 칙령을 내려 교단의 和合을 촉구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교단의 분열은 아마도 王의 불교 지원에 힘입어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더욱더 細分되어 급기야 大衆部와 上座部의 根 本= 部를 中心으로 하여 18 개 혹은 20 개 의 部派가 派生하게 된 것 이 다. 4) 세 일 론의 『島王統史 :cip ava ri:J. sa 』에 서 는 다음과 같은 18 部의 분파를 언급하고 있다.
2) 그러나 실계로 이 結果운 傳 하고 있는 律藏 에는 이러한 분 열 에 대 한 언급은 없 고, 세 일 온의 王 統 史인 D ip avam s a 와 1' \1a lz ii v a111$a 만아 이 결 집 의 결 정 에 붕 만을 품은 비구들이 大 衆 部라는 이 룸 밑에 따로 결집 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3) 이 혼 돈되 고 복 잡한 문 계 에 關 하여 는 L. de La Vallee Pouss i n 의 Council s and Sy no ds (Buddhis t ) , Encyc l op e dia of Relig ion and Et hi c s, Vol. IV, pp.1 79' ~85 참조. 4) 部派佛 敎의 派生에 관해 서 E. J. Thomas 의 The Hi st o ry of Buddhis t Thoug ht (London, 1933), pp.27~41 과 附 錄 11 운 참조 할 것.
l 麟: m二 k a :::ha;1:ka: BP::::::1t:a kd: 5 制多山部 Ceti ya vada
Mahim sasaka 7 {二說。 一(ix切::有: 部s :Sa:bb:aytt ;biki v a a d a 1 化地部 --+ II 上座部 __+ 11 經部 Sutt av ada Therav 죠 da I83 4法法`藏上5部部6 DDbhaammmmaugtt uatr tiikk a a 2 跋v n闇a 子p.l 部ttU aka 一 正賢密 墓靑林部部山 部SB ahmCadhmdaain tydiy aa nag i ak r ai k a 한편 說一切有部의 傳承을 전하고 있는 世友 Vasum it ra 의 『異部宗 輪論』은 다음과 같은 20 個 部派의 분열을 말하고 있다 : 1 一說部 Ekav ya vaharik a 2 說出世部 Lokott ar avadin I 大M衆ah部asa m_g 一bik a I34 5 鷄說胤假部部 PKraaujki ikaup ttii vkaa d in 多聞部 Bahusruti ya 6 制多山部 Cait ika II St上 ha 座vir部 a 1 說sa 7一8 rv 切sa- 西 北t有iv山部山d a 住a住f 部 윔_| _3 A u p att溫a rar 子s uP'avs a ilairi部tl a a fy a, 4~法賢正密5DBSShaah 上靑量林amna6dnr`部部部山mrm 죠aag o住7 y`t ati굴 tyr 部naia k ir ayiya a 8M a化bis地 a s部ak a- 9 D法ha藏rm部ag uptak a 10K as飮ya 光p iy部a =善Su歲va部r~ ka 11S au經tr 批a n部ti k=a =說Sa轉mk部ra nti ka 2 雪山部 (本上座部) Haim a vata =P ii rv asth a vir a
이들 部派둘은 현재 이름 정도만 남아 있는 것도 많고 실제에 훙 l 어서 인도철학사에서 이렇다 할 학설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은 불과 몇 개뿐이다. 特히 大衆部 계통의 문헌은 거의 다 散逸되었고 上座部계몽으로서 문헌이 보존되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敎說을 알 수 있는 학파들은 주로 세 일 론 계 몽의 上座部 Theravada, 說一切有部 Sarvasti va da, 經量部 Sautr a nti ka , 拍子部 Vats i p u tr i y a 等 이다. 이들 部派들은 대부분자기들의 관점에 입각하여 傳授한 經 • 律 • 論 三藏 Tr ipit aka 의 文獻’ 을 갖추고 있 었 다고 생 각되 지 만, 현재 그 三藏이 비교적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은 팔리 Pa li語로 된 세일본 상좌부계몽의 三藏과 梵語에서부터 漢譯되어 보존되고 있는 說一切 有部 계동의 三藏이다. 經은 원래 佛陀의 說法울 모은 것이고 律은 佛陀가 정한 승려생 활의 규범을 모은 것으로서, 일찍부터 經과 律은 口傳으로 편찬되 기 시작했다. 그러나 論은 이보다도 훨씬 후에 와서 작성된 것이 다. 그러나 論의 원초적인 起源도 일찍부터 經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으로서, 원래 불타의 가르침은 기억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 여 三界, 四念處, 五羅, 七覺支 등과 같이 法數에 따라 정 돈되 어 건해졌던 것이다. 이런 法數를 論母 ma t rka 라고 불렀으며 그것만을 전담하여 전수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5) 이러
5) Aiz gu tt ar a Ni ka y a, I. 117 에
한 경향은 각 부파간의 대립이 심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두드러져 서 각 부과는 자기들의 ‘ 철학적 입장에 따라 독립적인 論藏을 形成 하게 된 것 이 다. 그리 하여 세 일 론을 중심 으로 한 上座部 Theravada 에 서 는 『法集 Dhammasan g a ni』, 『分別 V i bhan g a 』, 『界論 Dha tu ka t ha 』, 『人施設 Pu gg ala p an ii a tti』, 『論事 Ka t hava tt u 』, 『雙 Yamaka 』, 『發越 Pa tt ana 』의 7 論을 論藏에 가지게 되었다. 세일론의 傳統에 의할 것 같으면 아쇼카王은 어느날 親히 自己의 別莊에서 목갈리풋다 릿사 Mog ga li pu t ta T i ssa 의 主宰下에 당시의 승려들을 모두 모은 다음
佛陀의 참 敎說을 물었다 한다. 이에 목갈리폿다는 佛陀의 敎說 을 分別說 v i bha jj avada 이 라 規定하여 僧團內의 여 러 異端을 除去하고 第三의 結菓會議룰 연 다음 거기서 『論 事 』를 說했다고 한다 .6) 이 제 이 上座部의 哲 學 을 먼처 考察하여 보자.
6) 이 과탈리풋다 Pa talip u tta에서의 第三次 結集會議에 관한 전몽은 오칙 세일론 의 王統史들에만 언급되어 있고 .:::z.. 歷史性에 관하여 많은 문계정 둘운 지니고 있 다. E. J. Thomas 의 Ti re Hi stor y of Buddhis t Thoug h t, pp. 33~37 창조.
2 上座部의 哲學 上 座部 Theravada 는 스스로의 哲學的 立場을 分別說 v i bha jj avada 아 라 부른다. 여기서 〈分別〉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付鼎E 는 事 物을 觀 察함 에 分析的으로 본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미 佛陀가 人間存在를 五羅의 諸法이 結合된 것이라고 分析的으로 본 것을 고찰했다· 上 座部는 佛陀의 이러한 분석적인 정신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생각한 다. 그리 하여 上座部는 현상세 계 를 法 dhamma 이 라고 불리 는 수 많은 存在要 素 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요소들은 서로 機能的 으로 依存하여 生起하였다가 그 作用이 다하면 사라진다. 따라서 現在 作用을 하고 있는 것들만 存在하며 또한 과거의 法아라 할지 라도 아직 그 作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대로 存續하고 있다. 예 를 들면 과거 의 業 으로서 아직 그 結果로서 의 業報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上座部는 수많은 法들 가운데서 人間存在을 설명하기에 필요한法 들을 中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三種으로 有爲法 sankha ta서ham.ma, 즉 相互條件的으로 發生하는 法둘을 分類한다. 첫째는 우리의 육제 적인 면을 구성하는 色法 Iii.p a 으로서 28 法을 든다. 둘째는 우리의 精神的 현상들로서 意識의 대 상이 되 는 心所法 ce t as i ka 에 52 法을 들며, 세번째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識의 作用 그 自體, 혹은 心 citt a 을 하나의 法으로 간주한다. 이 識은 實際에 있어서는 언제나 다른 法들과 함께 共存한다. 識은 감각기관들에 依存하며 순간순간 이어지는 意識들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五薩 가운데서
識 v ijii ana 에 해 당하여 色法둘은 色에 포섭 되 고 受 vedana, 想 samj iia, 行 책 mskara 은 心的 인 法들 ce t as i ka 을 포섭 하는 것 이 다. 이 들 有爲 法 가운데 서 宗敎的으로 가장 重要한 것 은 修行上 決定的 역 할을 하 는 52 개의 心的인 要素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行爲, 죽 業 karma 과 解脫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 서 上座部는 이 52 개 의 心所法을 解脫에 도움을 주는 25 개 의 善法 kusala-dhamma, 방해 하는 14 개 의 不善法, 그리 고 13 개 의 中性的인 法둘의 3 범주로 분류한다. 上 座部는 이상과 같은 81 개의 有爲法 外에 埋梁 n i b 悼 na 이 라는 한 개 의 無爲法 asankha t a-dhamma 만을 인 정하여 모두 합쳐서 82 개의 法으로서 7) 人間存在와 人間의 체험세계 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7) 이 法둘의 이 몽과 분유에 관해 서 , E. C 야;; e 의 B11ddhis t Thoug h t in India (London, 1962) 의 第 Il 部 第四:0, 第一節웅 참조할 것 • Conze 는 여 기 서 說一切 有部와 諭伽行哲學의 法의 분류도 함께 다우고 있 다.
3 說一切有部의 哲學 上座部는 센鼎 E 의 傳統울 가장 충실히 傳授한다고 자부했지만, 上 座部는 일찍부터 印度의 本土에서는 그 脈이 끊어졌고 단지 세일~ 島에서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印度本土에서 小乘佛敎를 대 표하다시피 하고 思想的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部派는 오히려 說 一切有部 Sarv 죠 s ti vada 였 다. 說一切有部가 上座部로부터 언제 파생 되 어 나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論事』가 作成될 무렵, 죽 아쇼카王 의 때에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분파로서 존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說一切有部(간단히 〈有部〉라고 부름)는 특별히 印度西北部의 간다라 Gandh 료 ra 나 카쉬 미 르 Kasmi r a 지 방에 많은 추종자물 가지 고 성 행 했으며, 서력기원 1~2 세기 경에는 印度의 西北部와 中央아시아에 걸쳐서 一大帝國을 건설한 쿠샤나 Ku~a i:i a 王朝의 카니쉬카 Kan i ~ka 王 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세력을 떨쳤다. 有部도 역시 上座部의 7 論에 비견되는 일곱 개의 論書로 구성된 論藏을 産出했다. 이 論書들은 現在 漢譯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포괄적이며 중요한 것은 『發智論 Jfi ana p ras t bana- 요 s t ra Jl 이 다. 8) 이 論은 서 력 기 원 전 약 1 세 기 경 의 人 物로 推定되는 카탸야니푸트라 Ka ty a y an ip u t ra 에 의하여 씌어진 著 害 로서 雜, 結, 智, 業, 大種, 根, 定, 見의 8 項目으로 佛敎의 敎 理룰 다루는 體系的인 著 書 이 다.
8) 나머지 6 개의 論 은 『發智 論 』에서 取及한 문재들운 部分的으로 다우는 論간 들로 서 六足 論 , 즉 6 개의 발이 되는 홉삼 문이 라 볼린다. 6 論 은 『染 異 門足 論 』, 『法 꿇 足 論 .!I, 『施 設論 』, 『識身足 論 』, 『界身足 論 』, 『品類足 論 』이 다•
『發智論』에 는 2 세 기 初半에 『大昆婆沙論 Maba vi bba~-sas t ra .il이 라 는 200 卷의 방대한 証譯 書 가 씌어지게 되었다. 이 주석서는 카니쉬 카王이 脇尊者라는 者에게 命하여 카쉬미르 Kasmi ra 지방에서 所謂 第四의 結 集 會議를 열어 거기서 편찬하게 한 것이라 한다. 이 論 은 단지 『發智論』의 주석 일 뿐만 아니 라 當時의 佛敎思想 밋 數論 Samlch y a 이 나 勝論 Va i se~ i ka 과 같은 外道의 哲學까지 포함하여 다루 면서 有部의 正統性을 確立하려고 하는 하나의 百科辭典的인 著作 이었다. 『大昆婆沙論』은 그후로 인도에서 小乘佛敎를 대표하는 저 서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有部의 學者들은 『昆婆沙師 Va i bb 료~ik a 』라 불리었다. 그러나 〈昆婆沙〉라는 말(廣說이라는 뜻)이 나타내듯이 이 論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후에는 그 要點만을 추린 綱要書둘 이 流行하게 되었다. 3 세기 초에 씌어진 法勝의 『阿昆 暑 心論』과 같 은 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綱要 書 둘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世親 Vasubandhu 의 『阿昆達磨供舍論 Abb i dharmako-sa-sas t ra 』이 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小乘佛敎의 철학을 대표하는 名著로서, 인도뿐만 아니라 中國 • 韓國 • 日本 등지에서도 小乘敎學의 入門 書 와 같이 연 구되어 왔다· 世親은 대체로 4, 5 세기 경의 人物로 看敬된다. 그는 간다라지방에서 태어나 카쉬미르지방에 가서 『大昆婆沙論』울 연구· 한 뒤 그 요점을 뽑아서 600 碩을 지은 후 거기에다 자신의 주석을 가하여 『保舍論』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有部의 哲學을 따르면서도 批判的인 眼目을 잃지 않아 때로는 經盤部等의 他哲學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기도 한다. 나중에 그는 大乘佛敎 로 轉向하여 많은 대승의 論 書 들을 남겼다. 이제 『供舍論』의 내용
을 간략하게 살펴봉으로써 有部哲學울 고찰하기로 한 다. 『供 舍論 』은 界,根, 世 r13T, 業 , 睦眠, 賢聖, 智 , 定 , 破我의 九品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諸法 의 本體와 作用운 밝히는 界品과 根品이며 破我品 에서는 外道의 哲學 까지 포함하여 我見을 破하고 있 다. 이 3 品을 中心으로 하여 『{具 舍論』의 根本的인 철 학적 입 장을 規定할 것 같 으면 〈人空法有〉의 哲 學 이라 할 수 있다. 人空 p udg ala-na i ra t m y a 이란 말은 인간은 영원불변의 自我가 없고 단지 물질적, 그리고 心的 要素둘 의 混合體에 불과한 現象的 存在 라는것이다. 이것은 人間을 色· 受 ·相·行· 識 이라는五 福 의 和 合으로 보는 佛陀의 人間親에 그대로 기초한 것이다. 다만 『{具舍 論』에서는 五 薩 대신 75 法을 들어 人間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上座部에서 82 개의 法으로 人間存在를 說 明하는 것을 보았거니와 『供舍論』의 75 法도 이 와 類를 같이 하는 思考方式인 것 이 다. 그러 나 有部의 哲學者둘 은 法을 存在의 기본적 요소로 보는 觀點이 점점 철처 해집에 따라 法을 實體視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人空法有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 이 다. 죽 사람은 空하나 사람을 구성 하고 있는 요소들은 항구적 으로 존속한다는 이론이다. 有部는 이 점을 〈三世實有 法體恒有〉 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有部哲學의 根本으로 삼고 있다. 죽 法의 나 타남과 작용은 순간적 인 現在뿐이 나 法의 體性 svabhava 은 과거 , 현재 , 미 래의 三世를 동하여 實體 drav y죠료서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有部가 法에 관하여 이러한 實 在 論 的 견해를 取하게 된 주요 이유 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한 행위( 業) 의 효력과 작용을 설명하기 위 한 것이었다. 만약에 과거에 지은 業 이 어떤 持紹的인 힘으로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순간적인 것뿐이라면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그 結 果가 나타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業 의 法則울 否定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有部는 業 力의 所在로서 三世 를 동한 法의 實有 률 상정하는 것이다. 有部에서는 또한 우리가 身體 나 言 語로 지온 業 의 作用을 설명하기 위하여 無表業 혹은 無表色 av ijii a ptirii.p a 이라는 독득한 개념을 設定한다. 無表色이 란 11 개의 色
法 중의 하나로서 外 音 E 에 나타나는 우리의 身體的言語的 행위가 그 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 행위의 結果롤 초래하도록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行爲의 因과 果룔 이어 주는 一 種 의 色法인 것이다. 『供 舍 論 』의 75 法은 72 개 의 有爲法 sarhskr t a-dharma 과 3 개 의 無爲 法 a s arhskr t a-dharma 으로 區 分되기도 하고 五位로 分類하기도 한다. 즉 色法 riip a 11 개 , 心法 citta 1 개 , 心所法 cait ta 46 개 , 心不相應 行 法 citta- vip ra y u kta - sarhskara 14 개 , 그리 고 無爲法 3 개 의 五位이 다. 이 것 은 無 爲 法 3 개를 제외하고 모든 有爲法을 五福에 準하여 분 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섯 가지의 法 가운데서 有部의 哲 學 的思 考 方式을 특칭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은 네번째의 범주, 즉 14 개 의 心不相應行法둥이 다. 心不相 應 行 c itt a-v ip ra yukt a-sarhskara 이 란 말은 意識 citt a 의 흐름에 영 향을 주면서 도 心所法 ca itt a 처 럼 意識 의 대상은 되지 않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죽 心 citt a 에 相應하지 않 는 行法 sarhskara-dharma 이 란 뜻이 다. 여 기 서 行法이 란 行 sarhskara, 즉 意 志的 性向에 의 거 하여 發生하는 有爲法을 말한다. 이 러 한 心 不相 應 行法으로서 有部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 得 p ra pti과 無得 a p ra pti―한 個人으로 하여 금 業에 따라서 어 떤 法울 얻거나 잃게 하는 힘들. 同分 sabha g a t a- 有 情 둘로 하여 금 各各 자기 들이 속하는 類의 共通 的 特性울 유지하게 하는 法• 命 ji v it a- 命根으로서 個人의 壽 命을 決定하는 生命力. 無想果 asarhjf iika -dharma, 無想定 asarhjf ii-s amapa tt i, 滅 盡 定 nir o dha- sama p a tti-이 셋은 모든 分別作用이 사라진 정신상태를 이루게 하 .는힘들. 相―모든 有 爲 法의 특징 인 生,住,異, 滅의 힘 들. 名身,句身, 文身_소리 와 말과 문장에 그들의 意味를 부여 해 주 는힘들. 以上과 같은 14 개의 心不相 應 行法들의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고찰 하겠지만 勝論 Va i se~ i ka 哲 學 의 多元的 宜在論의 思考方式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서 有部의 哲學이 定立될 당시 勝論哲 學 이 이미 形成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有部에 서 말하는 3 개 의 無 爲 法아 란 虛 空 akasa, 智慧 에 의 하여 얻 어 지 는 埋葉인 擇 滅 無 爲 pr ati sa rhkhy a -nir o dha, 因 緣 이 없 어 서 어 떤 法도 生起함이 없는 非 擇 滅無爲 a p ra ti sarhkh y a-n i rodha 로서 이 들 은 生, 住, 異, 滅의 四相울 여왼 絶對的이고 영원한 法들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供舍論』의 界,根, 破我品을 中心하여 有部哲 學을 살펴보았다. 『供舍論』의 나머지 部分둘 가운데서 世間品과 業 品과 睦眠品은 生 死의 果와 因 he t u 과 綠 p ra ty a y a 을 설 명 하여 , 賢聖品, 智品, 定品은 修行과 證悟의 果와 因과 綠울 설명하는 것이다. 『供舍論』은 이렇 게 매우 포괄적이며 짜임새 있는 論 書 로서 有部의 哲學뿐만 아니라 佛敎思想一般에 좋은 指針 書 이기도 하다· 世親 이후 安 慧 Sth ir a mati , 堅慧 Gui:i am ati , 陳那 Dig n ag a , 世友 Vasumi tra 등의 論師들이 출현 하여 『供舍論』에 주석 서 를 썼 다. 4 經量部와 役子部 說一切有部의 哲學은 諸法의 實體 svabhava 와 現相 lak~a l') a 을 구별 하여 諸法의 現相은 순간적으로 변하나 實體는 영원한 것으로 看敬 하는 일종의 多元的이고 實在論的인 사상이다• 이것은 諸法의 無我 와 無常을 강조하는 原始佛敎의 현상주의적인 철학과는 상당한 거 리가 있는 것으로서,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人 間의 또 하나의 갈망의 表現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有部의 實在論的 경향에 반발하여 그들이 의거하고 있던 論들의 權威를 부정하고 순수히 佛陀가 說한 經만을 따를 것을 주 장하고 나온 部派가 經 量 部 Sau t ran ti ka 였 다. 經 量 部는 2 세 기 에 구 마라라타 Kumarala t a 에 의 하여 說一切有部로부터 分離해 나왔다. 그 둘의 著 書 들은 남아 있지 않으나 『供舍論』이 나 다른 문헌들을 동해 서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經 景 部는 法의 實 體 svabhava 와 相 lak~a l') a 울 區別하는 有部의 입
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法이란 오칙 순간순간 변하는 相뿐이며 現在에 만 存在할 뿐이 다. 法은 순간적 k~ai;i ika 存在둘이 기 때 문에 생 기자마자 없어진다. 따라서 經量部는 有爲法의 四相인 生, 住, 異, 滅 가운데서 生과 滅만을 인정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經危部는 有 部의 根本的 입 장인 〈三世質有法體恒有〉몰 곧 바로 부정 하고 〈現在 有體過未無體〉를 주장한다· 그들은 法의 분류에 있어서도 色法가운 데서 四大와 心法 하나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모든 法은 인정하지 않 는다. 埋藥이라는 것은 일제의 傾腦가 사라지고 諸法이 寂滅한 상 태로서 有部에서처럼 어떤 實體的인 것이 아니다. 열반문만 아니 라 일체의 모든 法은 경 량부에 의할 것 같으면 實體的인 것 drav ya - dharma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단지 이 름에 지 나지 않는 假名的인 것 pr ajf iap ti-d harma 뿐이 다. 이 와 같이 볼 때 經量部는 實로 佛陀의 無 常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有部의 實在論的인 哲學을 거 부하고 唯名論的인 입장을 철처히 고수한 것이다. 經量部는 存在룰 순간적인 法들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知梵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만약에 存在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라면 우리가 어떤 事物을 지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만 을 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이 外界 의 世界롤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素朴한 믿음은 깨어지는 것이 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지각은 간접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각한는 것은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지나간 대상에 관한 印象들뿐인 것이 다. 그리고 우리는 인상들로부터 단지 추리에 의하여 대상의 세계 몰 알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外界의 認識가능성에 대한 회 의는 나중에 外界의 實在性까지 도 否認하는 唯識哲學으로 發展하 게 되는 것이다. 無常의 世界競을 저버린 有部의 實在論的 哲學에 반발했던 經量 部도 無我說과 業報를 어떻게 調和시킬까 하는 문계에 와서는 자신 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에 인간존재가 단지 순간적으로 변하는 諸法의 흐름 sam t ana 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 게 우리는 業의 主體로서의 나와 業報를 받는 나 사이에 同一性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과거에 지은 業은 어떠한 형태로 어
디에 存鎖하다가 果報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 經 臨部은 이러 한 문계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선 人間存 在 의 밑바닥에 그 흐몸이 의지하고 있는 바의 어떤 基體 asra y a 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것을 一味慕 혹은 根本語이라 부르며, 이 一味 福 은 언제나 동일한 본질로 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微細한 意識 으로서 輪廻의 主體가 되는 存在라고 한다. 이 識은 우리가 행한 좋고 나쁜 業 의 結果로 서의 種子 b ij a 들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이 種子들 은 우리가 지은 業의 蒸習 vasana 에 의 하여 우리 안에 남게 되 는 習氣 와 같은 것 으 로서, 이 種子들이 나중에 現行(現 勢 化)되어 業報 로서의 열매를 맺 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種子說로써 經益部는 業報를 說明하 며 有部에 서 말하는 〈無表業 av ijii a pti〉의 理論에 대 신 하고자 한 것 이 다. 經量部에 의 하면 種子들은 潛伏기 간 동안 不發하게 存縱하는 것이 아니 라 相續轉 變 sarh t a ti-p ar il) ama 하며 있다가 결과로서 나타난 다고 한다. 經量部의 이 러 한 사상은 나중에 大乘佛敎의 唯識哲學에 直結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招子部 Va t s ip u t riy a9) 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이 론을 내세웠다. 人間에게는 五薩과는 다른, 그러나 五 羅을 떠나서 따로 存在하지도 않는, 非卽非離羅으로서의 푸드갈라 p ud g ala 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業報를 받는 存在로서 輪廻몰 하거 나 淮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積子部는 이 푸드칼라와 五羅과의 관계를 불과 연료와의 관계 와 같다고 한다. 마치 불이 연료를 떠 나서 존 재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연료 자체는 아닌 것과 같다는 것 이다· 만약에 푸드갈라가 五薩 이외의 어떤 存在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영원한 존재일 것이며 이것은 常見에 빠지는 것이며, 만약에 푸드칼라가 五薩과 同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斷見에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푸드갈라는 五羅과 같은 有爲法도 아니요 五墓과 다른 無爲法도 아닌 規定하기 어려운 독특한 存在 라고 한다. 이 이론은 항시 변하는 현상적 존재로서의 人間의 자
9) 禎子部 란 이름의 뜻은 아직도 정 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푸드갈라 p ud g ala 의 理論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p ud g alavada 〉라고도 부은다. Thomas 의 前撮 찹 , pp. 39, 92~106 참조.
기동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埋藥을 有部에서처럼 어떤 非人格的인 法으로 看敗하지 않고 有爲法과 無爲法의 중간적 존재 인 自 我의 상 태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經 量 部와 拍子部의 아론들은 原始佛敎의 근본적 세계관인 無我의 사상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점들, 특히 輪廻와 業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로서, 후의 大乘佛敎의 아라야識 alaya v ij iian a 思想으로 이어지게 되 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上座部, 說一切有部, 經羅部, 柏子部의 學說을 고찰함으로써 서력기원전 약 3 세기부터 기원후 4 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발전된 上座部 Sth avir a vada 系統部派둘의 哲學을 살펴보았 다· 5 大衆部의 佛敎思想 한편, 大衆的 進步主義몰 표방하면서 上座部와 對立하여 자체내 에서 많은 部派룰 파생시킨 大衆部는 佛敎敎理發達上에 있어서 많 은 새로운 이론들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후에 大乘佛敎 발전의 기 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교적으로 대중부는 새로운 佛陀觀 을 전개했다· 佛陀가 入滅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에 대한 한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희박하여지게 되고, 信徒돌 간에는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그를 理想化하여 볼 뿐만 아 니라심지어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삼는경향도보이게되었다· 그리 하여 佛陀는 그 외모에 있어서 印度人둘이 理想으로 하던 위대한 人間 maha p uru~a 둘이 갖추어 야 하는 32 相 • 80 種好룰 갖추었고 그의 마음은 十力 • 四無長와 같은 신바스러운 힘들을 지녔다고 한다· 또 한 佛陀로서의 그의 生珪의 위대한 業섬t은 도저히 한 생애의 짧은 기간의 修行만으로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불타는 前生에서 수많은 훌륭한 功德울 쌓았음에 들림없다고 믿게 됐다. 이 에 따라 그의 前生을 이 야기 하는 本生談 J a t aka 들이 만들어 지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佛陀와 성자들을 추모한 나머지 그들의 造骨
이 나 造品들의 崇拜도 성행하게 되어 信徒둘은 탑 s tiip a 이 라는 것 을 만들어 그 안에 造骨을 安置하고 탑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면 서 參拜하며 獻花 로서 그들의 信 仰을 表 現하기도 했다· 이러한 佛 陀에 대 한 敬愛感과 信 心온 大 衆뭡i Mahasam g h i ka 에 서 더 욱 더 두드 러 쳐 , 佛pr E 를 완전 히 超世間的 lokott ar a 存在로 神格化해 서 까지 보 게 된 것 이 다. 大衆部에 의 할 것 같으면 諸佛世尊은 모두 出世間的 이며 모든 如來는 有漏法이 없으며, 그의 말은 모두 說法이고, 그 의 몸과 威力과 수명은 끝이 없으며, 그는 물음에 답하되 생각이 필요없으며 一충 1 j那의 마음에 一切法을 안다고 한다. 大衆部는 또 한 佛陀가 되 기 를 희 망하는 菩薩 Bodh i sa tt va 에 관하여 도 말하기 를 그들은 衆生을 利롭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惡越(動物이나 峨鬼와 같이 나쁜 存在)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大衆部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衆生의 心性은 본래 깨끗하나 客 麗과 같은 須 t齒에 의하여 더 럽혀질 뿐이 라고 하여 모든 衆生이 佛이 될 수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10) 有爲法은 現在에만 存在한다고 하 여 經量部와 같이 有部의 法體恒有의 思想울 받아들이 지 않는다. 大衆部는 無爲法으로 9 개물 인정했다 .• 죽 擇滅, 非擇滅, 虛空 , 空 無邊處, 識無邊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緣起支性, 聖道支性이 다. 이 것 은 有部의 3 無爲法 이 외 에 禪定의 四段階, 緣起法, I\ 正 道 같은 것을 영원한 實在냐 眞理로 간주한 것이다·
10) 以上의 大衆部의 敎說은 『異部宗 輪論 』, 『大正新 修 大 藏經 』 49, p. 15 에 根娘.
* 참고문헌 Eareau, A., Les secte s bouddhiq u e du Peti t Vehic l e. Saig o n, 1955. Conze, E. , Buddhis t Thoug h t in India . London, 1962. Guenth e r, P. H. V. , Phil o sof; lzy and Psyc l zolog y in the Ablzid l zarma. Lucknow, 1957. Keit h, A. B. , Buddhis t Phil oso p hy in 11ldia and Ceyl o n. Mookerjc e , S. , Buddhis t Phil o sop hy of Univ e rsal Flux. Calcutt a,
1935. Ny a nati lok a Mahath era, A Guid e Throug h the Abhid h amma Pi tak a. Colombo, 1949. Lamott e, E. , Hi st o i r e du Bouddhis m e Indie n . Louvain , 1958. La Vallee Poussin , L. de, Le dog m e et la ph il o sop h ie du Bouddhis m e. Paris, 1930. , tra ns., L'abhid l zarmakosa de Vasubandhu. Paris , 1923 -19 31 . Rosenberg, 0. , Di e Probleme der buddhis t i sch en Phi/ oso p hie. Heid e l- berg, 1924. Yamakami , Sog e n, Sy s te m s of Buddhis t i c Thoug h t. Calcutt a, 1934. Stc h erbats k y , Th. , The Centr a l Concep tion of Buddhis m . London, 1923. Thomas, E. J., The Hi st o ry of Buddhis t Thoug h t. London, 1933. 塚本啓祥, 『初期体敎敬固史 0 硏究』 水野弘元, [i'{L,.敎(J)分派&군(J)系統』, 『講座体敎』, Ill 福原亮嚴, 『有部阿昆達磨 論書 (J)晃達』 佐佐木現順, 『阿昆達磨思想硏究』 木村泰賢, 『阿昆達磨論 O 硏究』 , 『小乘 {A 敎思想論』
제 6 장 婆羅門敎의 再整備 1 婆羅門敎와 佛敎 불교나 챠이나교와 같은 자유사상적 종교운동은 종래의 바라문교 의 전동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다. 바라문傳統의 중십은 어디까지나 베다의 祭祀儀式과 이에 따르는 바라문계급의 종교적, 사회적 권 위에 있었던 것이다. 불교나 챠이나교는 강한 倫理的 合理性에 입 각한 종교로서 反祭祀主 義 的 성격을 지녔고, 社 會 的으로도 또한 超
世間的이고 平等主 義 的인 倫理觀으로 인하여 바라문계급의 득권~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이미 바라문교의 내부에서 도 일어나 우파니샤드 사상의 배경을 형성하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라문교의 전동에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佛 敎였다. 불교는 특히 마우리 야 Maur ya 王朝의 아쇼카王의 歸 依를 받아 그 의 지원 아래 크게 세력이 팽창하여 全印度的인 종교로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諸國들에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아쇼카王은 마우리 야王朝의 建 設者인 챤드라굽타 Candra g u pt a 의 손자로서 B. C. 269 년경 에 왕조를 물려 받았다. 챤드라굽타는 알렉 산더 大王의 印度 西北部 侵 入 (B.C. 327) 으로 인한 인도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당시 의 강대 국이 었 던 마가다 Ma g adha 의 난다 Nanda 왕을 제 거 하고 首都 과탈리 푸트라 P 칵 a lip u t ra 를 장악하여 마우리 야 Maur y a 王朝를 수립 했다 (B.C. 320). 챤드라굽타는 그의 大臣이며 유명한 『質利論 Ar tha - sas t ra 』의 著者 로 전해지는 카우틸리 야 Kauti lya (혹은 Carak y a) 의 보 조를 받아 인도의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統一國家롤 형성하는 偉業 을 이루게 된 것이다. 아쇼카王의 治鎖에 관하여는 다행히도 그가 남긴 바위와 石柱에 새긴 勅令둘을 동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칙령에 의할 것 같 으면 그는 많은 征服활동을 동하여 그의 영토의 확장에 힘쓰던 중 印度 中東部의 카링 가 Ka liitg a 지 방의 정 벌 후에 戰爭의 椿狀을 깨 닫 고 마음을 돌이켜 佛敎에 歸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로부터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 〈法에 의한 勝 利 dhammav ij a y a 〉를 추구하는 것을 그의 對外政策으로 삼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정책을 통하여 인접국가들로부터 많은 〈승리〉룹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內政에 있어서도 그는 仁政웅 베풀어 여행자를 위하여 길가에 果實나무를 심고 휴게소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일, 약초의 재배와 療義院의 설치 등 사회복지 사업에 힘썼다. 그는 특별히 음식과 제사를 위한 殺生의 禁止 랴됴 1 후 룰 강력히 추진했으며 그 자신 사냥을 하는 대신 佛敎의 造蹟地에 巡禮룰 행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法에 의한 동치를 위하여 法大 官 Dharmamahama t ra 둘을 지 방에 다 파견 하여 감독하게 까지 하였 다. 아쇼카王온 당시의 모든 종교교단들에 관용을 베풀었지만 그 자 신은 佛, 法, 僧의 三寶에 귀의한 불교신자였다· 그가 전파하려고 한 法 dhamma 이란 불타의 깊은 哲學的 眞理를 말한다기보다는 주 로 善 한 도덕적 행위를 뜻했지만, 여하튼 그것은 바라문의 사회윤 리 로서 의 〈다르마 dharma 〉가 아니 라 불교의 普通主義的 平等思想에 입각한 윤리적 善울 의미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녔던 것이다. 마우리야王朝는 아쇼카王의 死後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고 印度는 다시 정치적 혼란기로 들어갔다. B.C. 183 년경에는 바라문 출신 의 장군 푸샤미 트라 슝가 Pu~y am i tra Sun g a 라는 사람이 나타나 마지 막 마우리야王울 제거하고 숭가王朝를 수립했다. 그는 정몽 바라문 주의의 信奉者로서 베다의 動物祭祀를 부활시키며 佛敎를 탄압 했다.
이상과 같은 歷史的 상황하에서 바라문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傳統을 再整備하며 佛敎와 같은 大衆的 종교운동에 대 항하여 그들 의 社會的 底邊을 확대할 필요에 봉착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바라문교가 대체로 세 방면으로 새로운 지반을 구축해가는 것을 볼 수 있 다. 첫 째 로, 佛敎와 같이 解脫 mok~a 을 위 한 修行의 體系룰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이것은 요가 y o g a 사상의 체계적 발전으로 나아간다. 둘째로, 바라문교는 非아리얀 계동의 印度의 原住民들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土着的 信仰과의 習合을 동하여 大衆的 신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세째로는 佛敎에서 비교적 등한 시해온 在家者둘을 위한 生活規範으로서의 社會倫理體系의 확립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바라문교는 좀더 포괄적인 종교 로서 그 지반을 확대하면서 불교의 도전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바 라문교의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문헌은 서력 기원 약 200 년경에 完成되었다고 여겨지는 『라마야나 Rama y a i:i a 』와 『마하바라타 Mahabhara t a 』와 같은 奴 事 詩들이 다. 득히 『마하바라타』 는 실로 印度 古典文化의 총화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종교, 철학, 법률, 정치, 윤리, 신화, 역사 동 의 백과사전적 寶庫와 같은 문헌이 다. 이제 이 『마하바라타』를 중 심으로 하여 바라문교의 새로운 모습을 검토하여 보자. 2 쉬바神과 비슈누神의 信仰 본래 『마하바라타』는 베 댜시 대의 아티 안族들 중의 하나인 바라 · 타 Bhara t a 族의 軍談으로서 , 현재 의 델 히 Delhi 부근인 쿠루크세 트라 Kuruk~e t ra 라는 지방에서 벌어지는 王位 織 承을 둘러싼 전쟁의 이야 기 를 그 中心素材로 하고 있 다· 그러 나 약 1000 년 정 도 (B. C. 800~ 200 A. D. )의 오랜 세 월을 두고 자라는 동안 바라문들의 손에 의 하여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사상적 내용들이 混入되어, 현재에는 약 l0, 莫碩 가량의 방대한 敍事詩로서 18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宗敎的으 로 보아 『마하바라타』는 많은 부분이 바라문의 베 다적 전통을 i 대로 전수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베다에서 찾기 어려운 ~
점들도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목별히 중요한 것은 힌두고의 가장 大衆的 信 仰의 대 상인 쉬 바 S i va 신과 바 슈누 V i snu 신의 등장이 다. 쉬바神의 崇拜는 하라파 Hara pp a 나 모헨조다로 Mohenjo Daro 의 造 蹟發桐 에서 나온 인더스 문화의 유물들을 통하여 제시되었듯이, 아 리안족의 이주 이전의 인도 원주민들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듯 싶으나, 그후 아리안族들의 베다전통에서는 거의 종적을 감추게 되 었 다. 그러 나 『슈베 타슈바타라 우파니 샤드 Sveta s vata r a Up a ni~ d.!I 와 같은 후기 우파니 샤드에 와서 쉬 바는 베 다의 神 루드라 Rudra 와 同一視되고 다름아닌 브라만 自體로서 간주되게 된다. 이것은 그 동안에 쉬바神에 대한 信仰이 널리 發展되었음을 立證하는 것이 다. 『마하바라타』에 와서는 그는 온 宇宙를 創造한 위대한 神으로 崇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神話的 傳統도 풍부하게 형성되어, 히말라야의 높은 카일라사 Kail as a 산속에서 심한 苦行을 행하는 典 型的인 요가行者 y o gi n 로서 나타나 있다. 그의 膜想을 통하여 이 世 界는 유지되며 상두 i a ta롤 튼 그의 머리꼭대기에는 초생달이 걸 려 있고 이로부터 聖스러운 갠지스江이 훈러나온다고 한다. 그의 몸은 苦行者들처럼 재로 덮여 있고 그의 목과 팔은 뱀으로 휘감겨 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무기 三枝槍과 그가 타고 다니는 황소 난 디 Nand i가 있으며 그의 아름다운 아내 과르바티 Parvati 혹은 우마 Uma 와 함께 히말라야 산속에 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쉬바神은 또한 세계의 창조적 힘으로서 男根 li n ga의 상칭을 통하여 숭배되기 도 한다. 男根숭배는 이미 하라파文化의 유적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마하바라타』에서 쉬바神보다도 더 큰 大衆的 信仰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슈누神이다. 비슈누神온 물론 베다와 브라흐마나에서도 이미 중요한 神으로 언급되지만, 그가 대중적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베다 전동의 밖에서 숭배되고 있던 바수데 바 Vasudeva 나 크리슈나 Krsna 와 같은 神, 혹은 바라문의 종교전통 에 기원을 둔 또 하나의 神 나라야나 Nara yai:,. a 와 동일시된 후로부 터 이 다. 여 하튼 『마하바라타』에 는 비 슈누, 나라야나, 하리 Ha ri, 바 수데바, 크리슈나 등이 모두 같은 존재로 同一視되고 있으며, 〈바
가바트 Bhag a vat> , 죽 〈尊 賀 한 者〉, 〈 主 〉라는 뜻의 칭호로서 불 리어 지고 있어 그에 대한 신앙과 전통이 널리 퍼지고 발전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비슈누神은 世界와 萬 物의 根 源 으로서, 有名 한 神 話 에 의하면 그는 太古의 大 洋 가운데서 千 首룰 가진 뱀 쉐샤 Se~a 위 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의 배꼽으로부터 蓮 꽃이 자라난다. 이 연꽃으로부터 宇宙 創 造의 代行者 브라마 Brahma 神이 태 어 나서 세 계 물 창조한다. 세계가 창조되자 비슈누神은 잠에서 깨어나 最 上 天 인 바이쿤타 Va i ku~ t ha 에서 세계 를 다스린다고 한다. 그는 주로 네 개 의 팔을 가진 어두운 색깔의 人間으로 묘사되며 큰 독수리 가루다 Garu ga 를 타고 다닌다. 그의 아내 락스미 Lak~m I 혹 은 슈리 5 r i도 幸 運 의 女神으로서 널리 숭배되었다. 『마하바라타』 가운데서 비슈누 信 仰울 가장 뚜렷하 게 반영하고 있 는 것은 유명한 『바가바드 기타 Bhag a v a d G it a 』이다. 『기타』는 힌두 교의 바이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종교적 철 학적 문헌으로서, 인도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愛試 되고 있는 古 典 이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3 『바가바드 기 타』의 思想 『바가바드 기 타』는 원 래 바수데 바 Vasudeva 라는 人 格 神을 숭배 하 던 中印度西部의 바가바타 Bha g ava t a 派에 의 하여 만들어 진 독립 적 인 詩篇으로서, 나중에 『마하바라타』의 일부분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 정 된 다. 〈바가바드〉 란 말은 〈숭배 할 만한 者 〉 혹은 〈지 극히 尊貴 한 者〉라는 뜻이며, 〈기타〉는 이 至 尊 의 〈노래〉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 이 다. 이 바가바타派둘이 居하던 지 방에 크리 슈나 Krsna 라는 영 웅이 있었는데, 이 영웅은 神格化되어 至尊과 동일시되게 되었으며, 바 가바드신앙이 점차 퍼짐에 따라 바라문 문화의 중심지인 中印 度 東 部에까지 미쳐, 결국 바수데바-크리슈나神은 비슈누신과 동일시되 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가바드 기타』의 교훈의 主가 되는 크리슈 나는 비 슈누신의 化身 ava t ara 으로까지 간주되 게 된 것 이 다. 『마하바라타』는 바라타族中에 서 사촌간인 판다바 Pa1_19 ava 형 제
와 카우라바 Kaurava 형제들 간의 왕위계승을 위한 싸움의 이야기이 다· 『바가바드 기 타』는 이 敍 事 詩의 재 6 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직접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판다바 5 형제 중의 세째이며 크리슈 나의 찬구인 아르쥬나 Ar j una 는 그의 사촌들인 카우라바 형제들과 戰 場 에서 對陣하여 살육전을 벌이려고 한다. 그 순간 그는 용기를 잃고 만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同族을 죽이지는 못하겠다고 고 백윤 하자 , 아르쥬나의 수레잡이로서 그룹 돕던 크리슈나가 그에게 武士 K!}a t r iy a 로서의 의무 dharma 인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說 得시킨다 . 이것이 『바가바드 기타』의 형식상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계적인 哲學 論 書 라기보다는 여러가지 해탈의 방법을 제시한 실천적 성격이 강 한 종교적 作品이 다. 다시 말하면 『바가바드 기 타』는 그 전체 적 성 격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요가의 古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3 종의 요가를 말하고 있다. 즉 知의 요가 jiian a-yo g a , 行의 요가 karma-yo g a , 그리 고 信愛의 요가 bhakti -yog a 이 다. 각기 안 간의 知 • 情 • 意의 3 面에 相應하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 知의 요가는 知에 대한 전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에서 知란 상키야 Sarhkh y a 철학에 있어서처럼 영원한 精神으로서의 참자 아 p uru~a 와 물질적 • 현상적 pra krt i 自我와를 분명히 구별하는 지 혜를 의미하며, 혹은 우파니샤드的인 梵我一如의 진리와 神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한다. 信愛의 요가는 神에게, 특히 비슈누神에 게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輪 廻의 세 계 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다는 사상이 다. 信愛 bhak ti의 사상 은 이 미 『슈베 타슈바타라 우파니 샤드』에 도 나타나 있지 만, 『바가바 드 기타』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그후 의 모든 대중적 신앙운동과 有神論的 哲學思想에 至大한 영향을 끼 치게 되었다. 行의 요가는 『기타』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상으로 서, 바라문의 사회윤리 질서와 해탈의 길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해 주는 데 그 思想的의의가 있다. 바라문의 사회윤리에 의하면 사 람이 란 누구든지 자기 가 속한 계 급 var 1_1 a 과 나이 가 규정 하는 올바른
행위 dharma 를 하여 야만 하며 그렇게 해야만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히 그. 행위의 결과를 얻기 마련이며 따라서 輪 廻의 세계에 속박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파니샤드 이후에는 모든 행 위를 부정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끊어 버리고 苦行과 더불어 신비 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描 棄者 samn y as i n( 혹 은 沙 門 §r a mana) 의 理想 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목히 佛敎에 의하여 이러한 운동이 대폭적 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윤리 및 질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바 라문계급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사회문제로 등 장 하게 되었으며, 바라문교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된 것이 다. 따라서 『바가바드 기 타』의 行의 요가 思想은 社 會 倫理몰 준수 하는 행위 자체가 解脫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 조한다· 『기타』에 의하면 우리의 속박을 가져오는 것은 행위 그 자 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執 着 하는 욕망이라고 한다. 행위는 아 무런 욕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한 業報 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내면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기타』는 말하기 를 사 람은 자연의 본성 p rak rti상 잠시도 행위없이 촌속할 수 없으며, 문제는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하느 냐가관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체념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체 념 renunc iat i on of ac ti on 〉이 아니 라, 〈행 위 가운데 서 의 체 념 renunc iat i on in ac ti on 〉임 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리 하여 윤리 와 해 탈간의 긴장관계 는 카르마 요가 karma- y o g a 에 의 하여 지 양되 는 것 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위 를 하면서도 체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야 욕망이 없이 행위 아닌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 『기 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혜의 필요성이다. 목별히 상키야 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두개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되는 정 신 p uru~ 과 물질 p rak 갑i에 대한 혼동 없는 확실한 구별을 아는 지 식을 말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물질적 pra krt i 자아가 하는 것이며, 우리의 참자아인 정신 p uru~a 은 어떠한 행위에도 개 입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유로운 방관자 내지 관조자와 같다는 것
이다. 이 사실을 알 때에는 우리는 아무 욕망 없이 우리기 지닌 프라크르티의 필연적 성품 g una 에 따라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따름 이라는 것이다· 카르마 요가의 다론 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神에 대한 全的인 사랑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行爲는 순~ 한 것으로서 業 報몰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神의 은총에 의해 그와 사랑의 聯合을 하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 行의 요가란知의 요가나信愛의 요가로부 터 獨立해서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바로 知와 信愛에 입각한 行爲의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하든 『기타』가 欲望없는 行爲라는 개 념에 작안하여 社會倫理的 의무와 解脫이라는 초월적 이상을 동시 에 살리는 적극적인 행동의 哲學울 전개한 것은 印度思想史上 특기 할 만한 사상이 다· 『기 타』는 行의 요가라는 사상을 동하여 한편으로 는 四姓階級에 근거한 전통적인 사회질서를 옹호하지만, 다론 한편 으로는 信愛의 길을 통하여 女子나 슈드라 계급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大衆的인 구원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참으로 批棄한 者 sa ri:mya s i n 는 外形的으로 出家한 者가 아니 라 마음의 執着과 欲望으 로부터 자유로와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타』의 思想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知와 信愛를 둘 다 강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知에 가장 높은 修行의 목표를 두는가 하 면 다른 곳에서는 神에 대한 믿음과사랑이 최고의 길로제시되고있 으며 知는 信愛에 이르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전체적으로볼때 『바 가바드 기타』에는 우파니샤드적인 一元論的 思想과 상키야哲學의 二元論的 要素, 自覺의 宗敎과 信仰의 宗敎와의 差異 등이 아직 해 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후세의 베단타 Vedanta 哲學의 거 장들인 샹카라 Sa tik ara 와 라마누자 惡 manu j a 가 각 기 자기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이 양면 중의 한 면을 더 강조하는 『기 타』의 해석을 하게 된 것도 그 根操가 이미 『기타』 내에 있음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
4 『解脫法品』에 나타난 哲學思想 『바가바드 기타』와 더불어 『마하바라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철 학적 부분은 계 12 권 『解脫法品 Mok~adharma- p arvan.!] 이 다. 『해 탈법 품』의 철학사상도 결코 어떤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雜多 한 思想들이 여 러 모양으로 反復되 어 나타나는가 하면 相互牙眉的 으로 敍述되어 있기도 하다 .l)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상키야-요가 철학의 사상이다.
I) F. Edg e rt on , tra ns. The Beg inn i ng s of India n Phil o sop h y (Cambrid g e, Massachusett s: Harvard Univ e rsit y Press, 1965), pp. 255~334 참조.
우터는 이미 후기 우파니샤드들에 상키야철학의 사상이 나타나 있음을 언급했거니와 『마하바라타』의 『解脫法品』에는 이 原始상키 야사상이 더욱 발전되어 體系化된 상키야사상에 아주 가까운 형태 로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탈법품』의 印度哲 學史的인 意義는 후기 우파니 샤드와 마찬가지 로 체 계 화된 상키 야철 학 이전의 상키야사상의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상키야철학의 25 원리 및 세계轉發說의 기초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 울 우리는 볼 수 있다· 우선 감각기관의 수는 眼·耳 . 鼻 ·舌• 身 의 五根으로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섯번째의 감각기관이라 불리 는 意根 manas 이 심 리 기 관으로서 모든 감각기 관의 우두머 리 로 定立되어 있다· 또한 五元素說이 아론적 발전을 보아 五根에 해 당하는 五大 혹은 五元素가 설정되게 된다. 종래에는 地 나k • 火 • 風의 四元素만을 말하던 것이 空 ak 료요이 라는 소리의 성질을 지 닌 元素가 추가되어 인도철학의 일반적인 定說로 형성되었다 . 이 五大 와 더불어 그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지배적 성품으로서 香·味. 色·觸·聲의 五境이 言及된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考察하겠지 만 古典 상키야체계에서처럼 五境이 아직은 五唯로 대체되어 있지 않으며, 五大도五唯로부터 전개해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섯 개 의 감각기관인 五知根과 五作根 및 意의 11 根도 五大와 五境으로부 터 생 기 는 것 으로 되 어 있 어 , 自 意識 aha rilk ara 으로부터 展開된 것
으로 보는 고전 상키야의 說과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精神 的 原理인 푸루샤 p uru~a 와 物質的 원 리 인 프라크르티 p rakr ti의 개 념은 물론, 상키야철학의 세계설명의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는 3 要 素 g una 의 사상도 찾아볼 수 있 다. 『해탈법품』에는 이론적인 상키야철학뿐만 아니라 실천적 성격이 강한 요가의 사상이 아직도 상키야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채로 발견된다· 『해탈법품』은 요가는 사회계급이 낮은 자나 여자들 도 실천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상키야의 主知主義的 哲 學 에 대하여 요가의 대중적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2) 요가 의 실천방법에는 여러가지 相異한 見解들이 발견되나, 그 핵심은 감각기 관을 대 상의 세 계 로부터 退去하여 意根 manas 에 붙잡고 모든 생각의 活動을 멈추어서 우리의 참자아를 밝게 드러내는 것에 있다. 아트만 a t man 을 아는 것은 아트만 자체라 하기도 하고 혹은 知性 buddh i이 라 하기 도 하나, 意根 manas 이 라는 견해 가 지 배 적 이 다. 이 意 根이 아트만과 더불어 輪廻의 主體가 된다는 사상도 우리의 주목 울 끈다. 古典 상키 야철 학에 있어 서 부디 buddh i가 차지 하고 있는 지배적 역할과 대조몰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M펙 hii ra t a 12. 232. 32, The Beg inn in gs of India n Phil o sop h y , p. 'l:/2.
5 婆羅門的 社會倫理의 確立 불교가 아무리 왕성 한 布敎活動과 자유롭고 平等倫理的인 정 신을 바탕으로 하여 大衆的 宗敎로서 바라문교를 위협하는 세력을 형성 하였다 하더라도, 불교는 종교로서 한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불교가 佛陀 당시부터 出家僧들을 중심으로 한 寺院 中心的인 종교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解脫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갈망이 없는 在家者들의 日常生活에 관한 한 불교는 그들의 삶의 방 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는 윤리체계는 계공하지 못했다. 在家者 들의 종교생활은 三寶에 歸依하여 五戒를 지키며 僧伽에 필요한 物 質的 布施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오히려 그들의 日常生活의 慣習 속에 깊이 파고들어 가서 그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베다
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祭儀 的 行 爲 의 전 통 이었다. 더우기 우파니샤드 시대 이래로. 古代印 度 人들 가운데서 輪廻 와 業報 에 대 한 믿음이 보편화되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 동 들 이 善 한 행 위로서 좋은 果報를 받게 되는 것 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在 家者 둘은 자연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같은 메다 내에서도 브 라흐마나와 같은 것은 祭儀몰 주로 다루는 行 爲篇 Karma-ka i:icJ a 으 로서 우파니샤드와 같은 知 識篇 J nana - k 죠 nda 과 별 도 로 연구되어 왔 지만, 行爲의 문재는 브라흐마나 이래로 계속해서 바라문 지도 자들 의 관심을 끌어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다적 儀式들 의 규범 을 취 급하는 『天啓經 Srauta S iit ra 』, 在 家者 들의 社 會 生 活 의 義務를 더 폭 넓 게 규정 해 주는 『家庭經 Gr h y a S iit ra 』이 나 『 義務經 Dbarma S iit ra 』 들이 편찬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 義務 dharma 〉란 것은 宇 宙 의 法 則 그 자체에 근거하며 그것을 유지한다고 믿어지는 祭祀 의 의무 뿐 만 아니라 社 會 的 의무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 義務經 』은 이러 한 면에서 바라문교의 윤리전통상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서 누구나가 사회의 一 員 으로서 지켜야 하는 社 會 的 義務 와 儀禮 的규범 들을 상 세히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義務經 』은더욱더 발전하여 서력기 원 전 약 200 년경부터 기원후 300 년경 사이에는 古代印 度 人의 生 活 規範 을 더 욱더 완전 하게 체 계 적 으로 제 정 해 놓은 法典 ?harma Sas t ra 둘 이 편찬되게 된 것이다. 이 法典들 가운데서 가장 권위있는 것 은 마누 法典 Manava-d ha rma-sa~t ra (200 B. C.~100 A. D) 과 야즈나발키 야法典 Yajii .av al.k ya -smr ti(lO O A. D.~300 A. D. ) 같은 것 으로서 , 이 들은 마우 리 야王朝 이 후 人種的, 社 會 的, 經濟 的으로 점 점 더 복잡해 가는 社
會 的상황과佛敎와같은非바라문계의종교적, 사상적 위 협 에 대처 한 바라문들의 대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法典들도 우파니샤느처럼 知 識 과 解脫을 인생의 최고의 목 표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제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現世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의무적 행위 dharma 를 체계적으로 규정 해 주는 데 있다. 이 러한 義務 的 行 爲體 系의 根 幹 을 이루고 있는 것 은 무엇 보다도 소위 〈바르나아슈라마 vari:ia s rama> 制 度 , 즉 四姓 階級 Brahmai:i a, K~atr i y a, Vais y a , S ii dra 의 社 會 的 義務 와 人生의 四期brahma 댜 r i n, gr hasth a , vanap r asth a , sa 如 1 y as i n 에 서 個人이 추구해 야 할 理想的인 삶의 형태를 계시해 주는 계도이다. 特히 生의 四期 에 대 한 이 론은 現世에 서 社會的 秩序룰 준수하며 사는 在家者의 삶과 超世間的 解脫을 추구하는 出家者돌의 이 상을 時期的으로 配列 함으로써 兩者를 갈등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만들어 진 것 이 다. 즉, 生의 第一期는 梵行者 brahma 댜 r i n 의 생 활로서 , 兒 童 期를 마친다는 표식으로서 入門式 u p an 료y ana 울 한 다음 집을 떠나 서 스승 g uru 의 지도하에 베다 등의 학문을 배우며 禁悠的인 생 황을 한다. 第二期에 는 學習기 간이 끝난 다음 在家者 g rhas t ha 로서 결혼을 하고 神들과 祖上들에게 祭祀를 울리는 일, 後孫을 낳는 일 등을 하며 本能的 欲望과 富를 추구하는 생 활을 한다. 『마누法典』 은 이 時期를 바라문적 사회질서의 핵심으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 다. 第三期는 在家者로서 성공적인 삶을 마치고 孫子를 본 다음 숲 속으로 들어가서 隱 居하면서 膜想과 禁悠의 생활을 한다. 이것이 林樓者 vana p ras t ha 의 생활이다. 마지막으로 第四期에는 완전히 一 切의 社 會 的 維帶關係몰 끊고서 現世의 삶을 〈描棄한 者 samnya s in > 로서 오로지 解脫의 세계만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하여 바라문의 사회윤리체계는 人生이 추구해야 할 諸 價値둘을 치우침 없이 均衡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 교의 解脫中心的인 경향을 制裁하며 社會全體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것이다. * 참고문헌 Ap te, V. M. , Soc ial aud Relig iou s Li fe in the Grilz y a Sutr a s. Bombay , 1954. Banerje e , S. C., Dharma Su tra s: A St ud y in Tlzc ir Orig in and Deve-loPment. Calcutt a, 1962. Bii hl er, G. , tra ns. , The Laws of Mam,. SEE, XXV. Ox for d, 1886. Coomaraswamy , A. K. and The Sis t e r Ni ve dit a, tra ns., My ths of tlze Hi nd us and Buddhis t s . New York, 1967.
Dutt , R. C., tra ns., Tlze Mahii bh ii ra ta and Rii m i iya1 1a (abrid g e d edi- tion ). London, 1917. Deussen, P. and 0. Str a uss. tra ns., Vier Plzil o sop h is c he Tezte des Mahii bh ii ra ta . Leip z ig , 1906. Ed ge rt on , F., tra ns., The Beg inn in g s of India n Phil o sop hy . Cambrid g e , Mass., 1965. , tra ns., The Bhag a vad Gi tii. 2 vols. Cambrid g e , Mass., 1944. Glasenapp , H. von. , Zwei ph il o sop h is c he Ri im i iya 1J a . W ies baden, 1951 . Garbe, R., tra ns., Die Bhag a vadg itii. Leip z ig , 1905. Hop k in s , E. W., Yog a -te c hn iqu e in the Great Ep ic, Jo urnal of the Americ a n Orie n ta ! Soc iet y , XXII (1901) . , The Great Ep ic of India . New Haven, 1928. Joh nsto n , E. H., Early Samkhy a : An Essay on its Hi st o ric a l Develop- ment accordin g to the Texts . London, 1937. Kane, P. V., Hi st o ry of Dharmasiis tr a . 5 vols. Poona, 1930~1962 . Lamott e, E., Note s sur la Bhag a vad Gi tii. Paris , 1929. Nik am, N. A. and R. McKeon, ed. and tra ns., The Edic t s of Asoka. Ch ica g o , 1959. Radhakris h nan, S., tra ns., The Bhag a vadg itii. New York, 1948. Sm ith, V. A., Asoka: The Buddhis t Emp er or of India . 3rd ed. Ox for d, 1920. van Bu iten en, J. A. B., tra ns., The Mahii bh ii ra ti i. Chic a g o , 1973. Zaehner, R. C., tra ns., The Bhag a vad Gi tii. London, 1969.
제]I부 印度哲學의 體系化
제 7 장 상키야·요가哲學 1 印度哲學의 體系化 지금까지 우리는 서력기원전 1500 년경부터 기원전 2 세기 가량에 걷친 印度哲學의 形成期를 고찰해 왔다. 이 기간을 인도철학의 형 성기라 부르는 것은 이 기간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哲學的 思想둘 이 형성되어 후세에 와서 體系化된 哲學的 學派둘의 根本性格을 決 定지어 주는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다양한 思想들은 小乘佛敎의 몇몇 敎派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도 철서있는 論 理와 認識論的 批判융 통하여 수립된 體系的 理論이라기보다는 종 교적 修行과 體驗에 입각한 단편적인 철학적 통찰들이라 말하는 것 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철학적 문헌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우파니샤드나 佛敎經典들과 같이 주로 對話의 형 식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一定한 哲學的 世界觀을 一貫性있게 제계 적으로 진술하거나 옹호하는 論文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약 200 년부터는 종래에 바라문의 전통 內에서 여러가지 흐름을 형성하 여 오던 사상들이 각기 獨自的인 學派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들은 자기 들의 哲學的 見解둘을 간략하게 집 약하여 진술하는 經 s ilt ra 이 라는 문헌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 經들은 각 학파의 根本經典이 되 었으며,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에 대 한 駐釋書인 疏 bha gy a 와 이 疏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다루는 論
p rakara 1_1. a 이 씌 어 지 게 되 었 다. 이 러 한 印度哲學의 學派的, 體系的 發展은 아무래도 佛敎內의 部派哲學的 發展에 힘입은 듯하며, 이로 부터는 印度哲學의 발전은 各 學派晶1 의 相互意識과 論爭 가운데서 진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각 학파들은 그들의 形而上學的 見解먄 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의 주장을 論理的으로 認識論的으로 밑받침하려는 노력도 보이게 되었다. 이로써 印度哲 學은 自己反省的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上座部, 說一切有部, 經量部와 같은 小乘佛敎의 體 系的 發展울 고찰했거니와 이제부터는 바라문의 正統六派哲學과 大 乘佛敎哲學의 體系룰 그 哲學的 內容에 중점을 두면서 學派別로 考 察하기로 한다 .I)
l) 小乘部派佛敎의 哲學은 時期的으로도 아소카王을 前後로 하여 일찍 전개되기 사 작했기 때문에, 叔述의 편의 상 1 部(形成期)에서 다우었다. 그러 나 說一切有部나 經:lil:部 갑은 學派는 時期的으로나 內容的으로도 l1 部(體系期)에서 다우어도 우방 한 것입을 밝혀둔다. 2) 상키 야哲學은 세 계 문 25 원리 (tattva ) 에 의 하여 說明하므로 數문 중시 한다하여 數 論이라 붕려 왔다. 〈 Samkh ya 〉라는 말도 〈計算하는 者〉라는 듯-운 지닌 것으로 폴 이되고 있다.
2 상키 야 • 요가哲學의 傳統 상키야 S aril kh y a 哲學은 인도의 체계화된 철학학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2) 상키야 哲學思想은 우리가 이미 고. 찰한 바와 같이 『카타 우파니 샤드』나 『슈베 타슈바타라 우파니 샤드』 ' 와 같은 후기 우파니 샤드에 분명 하게 나타나 있으며 또한 『마하 바라타』의 제 12 권 『解脫法品』에도 여러가지 초기 상키야哲學의 형 태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득히 『바가바드 기타』가 형성된 당시, 죽 서력기원전 2~3 세기 경에는 상키야는 요가와 더 불어 하나의 잘 확립된 思想으로서 존재한 듯이 보이며, 『기타』에 사상적으로 至大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대 문헌 들에 나타나 있는 상키야철학은 어디까지나 아직도 충분히 발달되 지 않은 초기의 것으로서 나중에 형성된 古典的 無神論的 상키야哲 學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키 야철학은 전통적으로 카필라 Ka pil a 라는 기원전 4 세기 경의 聖賢을 元祖로 하며 , 그의 제 자 아슈리 Asuri 판차쉬 카 Pancasik a 동 에 의하여 대대로 전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돌 초기 상키야思 想家둘의 著 書 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카필라에 의해서 씌 어 졌 다고 전 해 지 는 『數 論解說經 Samkh y a p ravacana-su t ra 』은 학자들 에 의하면 빨라야 9 세기 정도에 씌어진 僞作으로 여겨지고 있 다 . 3) 17 세기의 베단타 철학 자인 비즈냐나빅슈 V iji'i anabh i k~u 는 이 經의 주석서몰 썼으며, 그는 또한 상키야철학에 대한 중요한 기본 서로서 『數 論精要 Samkh y a-sara 』라는 책을 썼다. 현 존하는 古典 상키야철학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바라크리쉬나 Isvarakr~i:i a 自在黑의 『數論碩 Sam kb y a 一 kar i ka 』이 다. 우리 는 이 『數論碩』에 와서 야 數論哲學이 분명 히 二元 論的 , 無神論的 哲學으로 定立되는 것을 보게 된다. 『數論碩』 은 기원후 4 세기 경에 씌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4) 모두 70 절로 되어 있어 『數論七十 Samkh y asa pt a ti』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인도의 古典 哲學 書 가운데서도 白眉로 간주되는 名著이다. 8 세기의 哲學者 가 우다파다 Gau qa p ada 의 社釋 書 『數論碩疏 Samkh y aka ri ka-bh 료~y a 』와 9 세 기 의 버 1 단타 哲學者 바차스파티 미 슈라 V 료 cas p a tirni sra 의 주석 서 인 아 眞理 月 光 Ta tt vakaumud i』이 있 다. 상키야哲學은 獨自的인 학과로서 근세까지 그 명맥을유지하지는 못했으나 상키야哲 學 의 여러 理論들은 베단타哲學 등 他哲學학파들 에 흡수되었으며 5) 印度人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3) 이 經 은 Sankara 에 의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9 세기의 Vacas pati m i sra 는 이 經 대신에 Ii'數 論碩』 에 주석 윤 쓴 것으로 보아 상당히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4) li'J)lk 論碩』 은 560 년 경 에 眞諦 Paramar t ha 에 의 하여 주석 과 함께 洪譯되 었 다. 5) 17 세 기 의 비 슈누派의 베 단타哲 卑者인 비 쥬냐나빅 슈 V ijii anabh i k~u 는 상키 야哲쵸 울 냐야-바이쉬 1 시카 N ya y a-Va is e~ i ka 哲 學 과 더불어 영원한 베단타 臼理의 한 면 으로 간주했 다. 그는 상키 야哲 學웅 神 의 본질을 깨 닫지 옷하는 자 흉 위 하여 , .::z.둘 이 物質과 영혼의 차이윤 알지 옷할까봐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
상키 야철 학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는 요가학파의 문헌들 이다· 요가는 상키야철학의 세계관과 형이상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 둘이고 있는 동시에 實賤 • 修行의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학파로
서 , 『요가 經 Yo g a-s iit ra 』이 라는 근본경 전 을 갖고 있 다. 『요가 經 』 은 전통적으로 파탄잘리 Pa t a iij a li라는 B. C. 2 세기의 인물에 6) 의 한 著 합 로 알려져 왔으나, 사실상으로는 서력기원 후 4~5 세기 경 에 야 完成된 古典으로 간주된 다. 7) 그러 나 물론 요가 y o g a 的인 修 行 의 傳統은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하여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다· 요가의 기원은 아마도 이미 베다時代부터 바라문들이 祭祀 때 에 神秘 h9 이고 초자연적인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행하던 苦 行 t a p as 의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보다도 더 앞 서, 인더스文明의 造 蹟 가운데서 요가의 座法울 한 神 像 이 발굴됨에 따라 요가는 아마도 베다나 아리안족의 풍습에 기원을 둔 것이 야 니라 非아리안적인 行法이 아니었는가라는 추측도 자아내고 있다.
6) J. H. Woods 는 그의 The Yog a Sy st e m of Pata i i jali (Cambrid g e : Harvard· Univ . Press, 1914) 에서 이 파탄 잘 리와 B.C. 2 세기의 文法 學者 파탄잘리와는 다 은 人物로 간주하고 있 다• 그러 나 Das gu pt a 는 兩 者문 同一人으로 본다. 그의 A 7) H이i s t 정o r에y o관f 해In 서d는ia n W Poohdils o 의so p견 hy 해 , 에V o따l. 룹I ,. p. 238 참 조.
여하튼 『카타 우파니샤드』에서는 〈요가〉라는 말은 감각기관과 마음 을 制御하여 絶對者몰 인식하는 방법을뜻하고있으며, 이러한 행위 는 이미 佛陀나 혹은 그에게 禪法 dhy ana 을 가르쳐 주던 出 家修 行 者들 가운데서 盛行하였던 것이 다. 『마하바라타』에 와서는 요가는 상키야와 더불어 두 개의 分明한 思想的 體 系로서 認定되고 있다. 상키야는 解脫에 이르는 理 論 的인 接近으로, 그리고 요가는 같은 目的을 위한 實 錢的, 修 行的인 방법 으로 구별되어 이해되고 있는 것아다. 이러한 오랜 실천적인 전동 이 他思想들아 哲學的인 體系로 定立됨 에 따라서 『요가 經 』에 와서 다듬어지고 정리되게 된 것이다. 『요가經』의 柱 釋書 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뱌사 V y asa 의 『요가 經 疏 Yo g a -siit ra-bha 흔y a 』이 다. 經과 疏가 모두 〈 數 論의 解明 Samkhy a - p ravacana 〉이 라는 副題몰 달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이 들이 씌 어 진 당 시에 8) 이미 상키야哲 學 과 요가는 同一한 思想으로 이해되고 있었음 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요가哲 學 은 有神論的인 사상으로서 本
8) J.H . Woods 는 經 의 年代 문 300~500 년경, 疏 의 年代 문 650~800 년경으로 잡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많은 異說 둘이 있어 확 실하지는 않다.
來부터 상키야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9 세 기 의 바차스파티 미 슈라 Vacas p a ti m i sra 는 U l=사의 疏에 『眞理通 暎 Ta tt vava i sarad i』라는 復証룰 썼으며 이에 의하여 요가哲學의 學 說은 고정 되 게 되 었 다. 16 세 기 의 비 츠냐나빅 슈 V ijiia nab hik ~u 도 뱌 사의 疏에 『요가評釋 Yo g a-var tti ka 』이 라는 주석 서 와 『요가精粹綱要 Yo g asara-sa thg raha 』 라는 요가哲學의 綱要 書 를 처 술했 다. 이제 이슈바라크리쉬나의 『數論碩』과 파탄잘리의 『요가經』, 그리 고 바차스파티미슈라의 柱釋을 中心으로 하여 상키야·요가哲學의 대강을 살펴보기로 하며, 때에 따라 두 思想의 중요한 差異點둘을 언급하기로 한다. 3 物質 상키야철학은 佛敎와 같이 세계를 苦로 보며, 이 苦를 극복하려 는 데에 철학적 사유의 주목적이 있다· 또한 그 세계관에 있어서도 불교와 같이 요가의 체험에 기초한 心理學的인 世界觀, 죽 인간의 십리현상의 관찰을 중심하여 세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질으며, 一 元論的인 세계해석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키야철학은 불 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인간의 영원한 自我, 죽 푸루샤(精 神 : p uru~a) 라는 실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佛敎와 결정적 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키야철학은 세계의 모든 존재를 精神 p uru~a 과 物質 p rak 갑i이 라는 두 개 의 형 이 상학적 원 리 로서 설 명 한 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 상키야철학의 근본을 파악 하게 되는 것이다. 프라크르티, 죽物質이란 개념은 상키야哲學에서 목수한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라크르티는 푸루샤를 제외한 세계의 一切現象이 그 로부터 발전되어 나오는 母胎와 같은 것으로서 未顯現 av yakta 이라 불린다. 죽, 경험의 세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계를 지닌 현상들 이 그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가능성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 자체는 어떤 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로부터는 모든 것이 발전되어 나오는 세계의 質料的 원인 up ad ana-karai;i a, 혹은 제 1 원인
p radhana 이 되 며 , 무한한 창조적 힘 sak ti이 되 는 것 이 다. 상키 야철 학에 의하면 無에서 有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원인에 이미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결과란 눈에 보이지는 않 으나 잠재적 으로 이미 원인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다. 이 러한 견해롤 印度 哲學 에서는 因中有果論 satk a rya - vada 이 라 부른다· 죽 결 과 kar y a 가 원 인 karana 속에 이 미 존재 sat 한다고 하는 견해 이 며 , 說一切有部와 같은 小乘佛敎나 냐 o]:- 바이 숴 1 시카철학이 대표하는 因中無果論 asa t kar y avada 과 대조를 이 룬 다. 因中有果論을 대표하는 철학 가운데서도 결과를 원인의 참다운 변형으로 보는 轉變說 p ar ii:i amavada 이 있는가 하면, 결과를 원인의 환상적 나타남으로 보는 假現說 v i var t avada 의 인과론도 있 다. 前者 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상키야철학이고 後者는 不二 論 的 베단타 哲學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변설에 의할 것 같으면 진흙 안에 이미 항아리가 보이지 않는 형 태이지만 존재하고 있고, 항아리는 진흙의 참다운 변형인 것이다. 반면에 假現說에 의할 것 같으면 진흙만이 유일한 실재이고 항아리 는 거짓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키야의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는 解體 p rala y a 와 進化 sar g a 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한다. 해체의 상태에는 만물이 프라크 르티 속에 참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발전되어 나타나지 않는 상 태를 말하며, 진화란 프라크르티로부터 모든 현상이 순차적으로 발 전되어 나오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이 해체와 진화를 되 풀이하게끔 하는가? 어찌하여 未顯現인 프라크르티는 그 자제로서 해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상키야哲學의 說明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라크르티 자제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상키 야에 의 하면 프라크르티는 사트바 satt va , 라자스 raja s , 타마 스 t amas 라는 세 종류의 요소 gu na 로 구성 되 어 있 다. 이 세 요소들 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결과들로부터 추리된 존재들로서, 사 트바는 知性, 가벼웅, 줄거움, 빛남 p rak 죠 saka, 흰 색깔의 성질을 갖 · 고 있으며, 라자스는 힘과 끊임없는 운동, 고동, 빨간색의 속성을
가지고있고, 타마스는질량, 우거움, 沮止, 無知, 무감각과까만색 의 속성을 지녔다고 한다. 세계의 만물의 차이는 프라크르티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그 중의 어떤 것아 지배적인 가 하는 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 세 요소는 서로서로에 영향 을 주며, 限界와 形態가 없는 프라크르티의 상태로부터 점점 더 분 명한 한계와 형태를 가전 현상세계를 산출시킨다. 만약에 이 세 요 소가 꼭 같은 비 율로 섞 여 있어 완전한 平衡 sam y avas t ha 을 이 루고 있을 때에는 비록이 요소들 자체는 바삐 운동을계속하고있기는하 지만 어떤 요소의 성질도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프라크 르티는 아무런 변형도 없이 未顯現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프라크르티의 이러한 평형상태가 깨어지게 되 는가 ? 상키 야哲學의 이 문제 에 관한 대 답은 다음과 같다. 프라크 르티는 단지 푸루샤의 곁에 있게 됨으로써 p uru 훈 a-sa mnidhi -ma tra 그 평형이 깨어진다고 한다. 마치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兩者의 接觸 sam y o g a 이 있어 야만 비 로소 세 계는 프라크르티 로부터 전개 되 어 나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 두개의 異質的인 存在는 접촉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키야는 말하기를 푸루샤와 프라크르 티의 접촉은 서로가 서로플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푸루샤 는 解放 ap avar g a 이 나 享受 bhog a , en j o y men t를 위 하여 프라크르티 몰 필요로 하며, 프라크르티는 자신을 보고 알며 즐기는 者로서 푸 루샤룬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혹은 장님과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가 서로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키야哲學의 설명은 說得力의 不足함을 인 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상키야哲學에서 주장하는 대로 解脫이란 푸루샤와 프라크르티의 分離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푸루샤가 解 放을 위하여 프라크르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상키야哲學은 어떻게 하여 전혀 異質的 인 두 개의 形而上學的 實 在 사이에 처음부터 접촉이란 것이 가능 한가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믈 해결하기 위하여 상키 야哲學은 그 접촉온 실제상의 접촉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보일 분 이 라는 說 sam y o g죠 bhasa 을 내 세 운다.
여하튼 상키야에 의할 것 같으면 푸루샤와 프라크르티의 접촉에 의하여 프라크르티의 내적 평형상태는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 접촉 에 의하여 제일 먼처 영향을 받는 것은 프라크르티의 三要素 가운 데서 운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라자스 ra j as 이다. 이 ·라자스가 먼처 혼들리기 시작하면 사트바와 타마스도 따라서 혼들리게 되며 進化 의 과정은 시작되는 것이다. 일단 그 군형이 깨어진 프라크리티의 展開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계일 먼처 특정한 성격을 갖고 나타나는 것은 사트바를 그 지배 적 인 성 품으로 하는 붓디 buddh i이 다. 붓디 는 우주론적 으로는 그로 부터 다른 모든 물질적 세계가 전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위대한 것 maha t〉이 라고도 불리고, 심리적 •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붓디, 죽 知性이라고 불린다. 이 붓디는 그 속 에 우주가 해체될 때 프라크르티 속으로 참재해 버렸던 모든 개인 적 붓디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붓디둘은 과거의 無數한 轉生을 동하여 얻은 기 억들과 정 신적 性向들 sari:J .s kara, menta l d i s p os iti on 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봇디는 어디까지나 프라크르티, 죽 物質의 産 物로서 그 自體는 識 cit의 性品을 갖고 있지 않다. 봇디는 그것을 純粹識인 푸루샤의 反射作用을 동하여 받는다고 한다. 붓디 는 마 치 거울과 같아서 푸루샤의 빛이 있을 때만 다른 물건들을 비추게 되어 우리의 정신활동, 인식, 경험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붓디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섭세한 물 질, 죽 사트바의 요소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봇디 는 푸루샤와 가장 비슷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푸루샤에 가장 가 까운 존재로서 푸루샤와 프라크르티의 중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경험과 인식 활동은 識을 지닌 푸루샤와 대상과 관계를 맺은 붓-디가 상호 협력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경 험과 인식의 주체는 푸루샤만도 아니고 봇디만도 아니고 兩者의 교 섭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상키야철학의 認識論에 있어서 홍미로운 사실은, 미세한 사유물질인 봇디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물의 形 相 辻 ara 올 認知할 때나 혹은 사고행위를 할 때, 그 자신이 대상들
의 각기 다른 형태들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붓디는 단순히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대상들을 수동적으로 受納하 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상들에 따라 변모하여 인식과 경험이 성립한 다는 것이다. 봇디 로부터 아함카라 abamkara( 我f§ ) 라 불리 는 個 體 化의 原理가 전개되어 나온다. 心理的으로는 아함카라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自 我意識과 我執과 ’ 橋漫 abh i mana 이 다· 푸루샤는 自 身운 바로 이 아 함카라 로 착각하여 스스로를 행위의 主 體 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아함카라는 붓디와 마찬가지로 宇宙的 存在 論 的인 원리이기도 하 다. 따라서 그것의 지배적인 성품이 사트바냐 라자스냐 타마스냐 에 따라서 세 가지 방향으로 아함카라는 발전하게 된다. 라자스 는 주로 운동의 성품을 지녔으므로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발전을 하지 않고, 사트바와 타마스를 도와서 지배하도록 하는 일만 한다 고 한다. 사트바의 힘이 지배적이 되면 아함카라는 내적 감각기관 인 意根 manas 과 五智根 jruina -in d riy a , 죽, 보고, 듣고, 만지 고, 맛 보고, 냄 새 맡는 능력 과, 五作根 karma-in driy a , 죽, 말하고, 손을 움 직이고, 발을 옮기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능력들을 산출한다. 여 기서 根 i ndr iy a 이 란 말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기관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 라 그 기관을 통하여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 sakti 등을 의 미 하는 것 으로서 , 推論 anumana 을 통하여 아는 것 이 지 지 각 pra - ty ak~a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상의 프라크르티의 전개물 가운데서 붓디와 아함카라와 마나스 ( 意根 )를 심 리 기 관 an t a l;i -kara i:i, a 이 라 부르며 , 나머 지 十根은 외 적 기 관 bah ya -kara i:i, a 이 라 부른다. 숨 p r 료 na 은 심 리 기 관의 기 능으로 간주된다. 외적 기관은 외부세계를 심리기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심리기관의 기능을 위한 조건이 된다. 마나스는 심리기관과 외적 기관의 매개체와같은것으로서, 감각기관을 동하여 들어온 無 分別的 nir v ik a lpa 감각의 所與 sense da t a 를 언 어 를 매 개 로 하여 分 別하고 종합하고 해석하여 分別的인 savik alpa 판단적 (〈이것온 돌이 다〉, 〈처 것 은 빨갛다〉 등) 지 각으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상키 야 철학에 의할 것 같으면, 마나스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감각기관들과 동시에 접촉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이것 은 뒤에 고 찰하겠지만, 냐야-바이수~ l 시카 N yay a-Va i se !li ka 에서 말하는 마나스에 대한 견해와 대조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마나스의 作用 다음에 아 함카라는 지각활동을 〈나〉라는 개념에 연결시켜 자기 경험으로 만 든 다음 봇디 buddh i에 전달한다. 봇디는 감각기관과 마나스 를 동 해 들어 온 形相들에 따라 변모한다 budd hi-v rt ti. 그러 나 이 것 만으로 는 아직도 認識이 성립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붓디는 어디까지나 프라크르티, 죽 物質의 발전된 상태이며 그 자체로는 識 cit의 성품 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루샤의 빛을 반사하여서만 비로소 지 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이 볼 것 같으면 포라크르티의 존 재론적 전개 과정은 인간의 인식 과정과는 정반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인식의 성립에 관한 관찰과 분석을 동하여 인식의 가 능 근거를 이루는 존재요소들을 거꾸로 울라가며 찾는 것이 상키야 철학의 존재론적 사유과정인 것이다. 다론 한편, 重量의 성격을 지닌 타마스가 지배하는 아함카라로부 터는 五唯 tan matr a , 죽, 音 깅罰 • 色 • 味 • 香의 본질을 이루는 미세 한 물질 이 방출된 다. 이 五唯의 배 합에 의 하여 五大 bh iit a 가 산출된 다. 죽, 音의 본질 로부터 는 空 aka§a, 音과 觸의 결 합으로 風 vay u , 音 • 觸 • 色의 결 합으로 火 tej a s , 音 • 觸 • 色 • 味의 결 합으로 7]( ap , 그리고音·觸•色·味·香의 결합으로地 k !liti의 五大가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五唯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五大의 성질들 에 입각하여 그로부터 逆으로 추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五唯의 존재를 설정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제 1 차 적인 진화 sar g a 의 과정이 끝나고 五大의 여러가지 결합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세계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프라크르티는 그 내적 균형이 깨어진 후 붓디로 발 전한 다음, 한편으로는 아함카라에서부터 11 개의 根으로 발전하는 내적 전개와, 五唯를 거쳐 五大로 발전하는 외적 전개 과정을 거쳐 현상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함카라와 五唯는 더 특정지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無決定者 av i se !i a 라 하며, 十一 根과 五大는 이미 특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決定者 v i ~e 우 a 라 부른다.
또한 붓디와 아함카라와 마나스는 五唯와 함께 인간의 細身 ling a - sarir a , subtl e bod y을 이 룬다고 한다. 細身이 란 우리 의 육제 가 파괴 되는 때에도 계속해서 存緩t하여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輪 廻의 주체가 되는 몸이다. 이 細身은 그 안에 과거와 現世의 業을 동하여 形成된 우리의 精神的 性向 samskara 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죽 덕 dharma 과 악 adharma, 지 혜 jii ana 와 무지 ajf ian a, 격 정 vair a g ya, 無欲 ava i r죠 gy a, 超 自 然的 힘 ais v ary a , 약함 ana i sva ry a 의 8 가지 性向 들이다. 細身은 이러한 性向에 따라 그것에 알맞는 형태로 다시 태 어난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배우가 여러가지 역할을 하듯이 이 細 身은 여러 형태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상키야哲學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프라크르티의 展開과정은 無意識的이긴 하지만 어떤 目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죽 푸루샤의 享受 bho g a 나 解放 apavarg a 울 위 한 目 的論的인 의 미 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푸루샤에 관한 상키야哲學의 이론을 검토해 보자. 4 精神 프라크르티는 세계의 質料的인 原因은 되나 結果는 아닌 존재인 반면에, 푸루샤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어떤 존재이다. 상키 야철학은 이 푸루샤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유물론적인 철학이 되 지 않는 것이다. 푸루샤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부분과 성질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나 브라흐만과는 달 리 상키 야哲學은 푸루샤가 무한히 많은, 그러 나 본질 적 차이 는 없 는 個別者的 存在둘이 라고 한다. 이 푸루샤는 순수한 識 , 혹은 傍 觀者로서 결코 對象化될 수 없는 存在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지 식이 성립되는근저에 깔려 있으나, 대상에 따라수시로변하는지 식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봇디이지 푸 루샤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키 야에 의 하면 푸루샤의 존재 도 프라크르티 처 럼 推論 anum~a
에 의하여 알려지는 존재라고 한다. 상키야는 푸루샤의 존재에 관하 여 여러가지 층명을 한다. 물질적 세계는 앎이 없으므로 그것을 경 험하는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한다. 죽, 對 象 은 主 體 룰 필요로 하며, 이 주체는 푸루샤인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종교적 갈망이 있다· 그리고 이 벗어남은 벗어나고자 하는 것, 죽 물질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프라크르티의 세계에 있는 모든 부분들로 구성된 사 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목적과 수단의 일치는 어떤 意識 的인 존재 물 위한것이라고한다. 상키야는푸루샤 를 이러한 자연 질서의 계획자 des ign er 로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 나, 이러한 의도적 질서의 혜택을 받는 의식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우리는 여기서 無神論的인 상키야철학과 有神 論 的인 입장을 취하 는 요가철학의 차이를 참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키 야와 요가는 둘 다 프라크르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일정한 질서와 合目的性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원래 知性울 갖고 있지 않은 盲目的인 프라크르티의 어디서 그런 질서와 조화가 생기게 되는 것 인가이다. 이 점에 관하여 상키야는 프라크르티 자체가 푸루샤에게 봉사하려는 목적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전개 과정에 있 어서 아무런 외부적 힘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요 가철학은 포라크르티에는 知性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 런 목적성을 가질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모 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행한 業 에 합당한 業 報를 받도록 전개할 수 있는 것은 프라크르티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한다. 따라서 요가哲學은 全知全能한 神 이슈바라 Isvara 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神의 영원한 意志에 따라서 프라크르티의 전개 과정은 인도되며 . 푸 루샤의 이익이 보호되고 실현된다는 것이다. 본래 『요가經』 自體내에서는 神은 實 際的인 기능과 활동은 하지 않고 다만 영원히 속박을 모르는 푸루샤로서 요가行者둘의 膜想의 대상아 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社釋家들에 와서는 이 러한 非活動的인 神의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그를 활동적 인 존재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뱌사 V y asa 는 神을 미세한
物質로 몸을 삼아 宗敎的敎訓도 주며 은총으로 信者둘의 구원을 도우기도 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바차스파티미슈라는 世界 의 주기적인 進化와 解體, 그리고 우주의 도덕적 법칙을 관장하며 베다를 啓示하는 者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5 解脫論 그러면 푸루샤의 解放온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살피기 위 하여 우리는 우선 무엇이 상키야哲學에 있어서 속박의 상태인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미 프라크르티는 解體와 進化의 과정을 끓임없이 반복하고 있음을 얘기했다. 이 프라크르티의 전개 의 시작은 프라크르티와 푸루샤의 接觸 samy o g a 때문에 가능한 것 이며, 특히 푸루샤는 프라크르티의 최초의 전개물인 붓디와 가장 가까와서, 그 兩者의 교섭상태에서 경험과 인식이 가능해지며, 따 라서 모든 욕망과 業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붓디는 푸루샤가 프라크르티에 混入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촉 혹은 혼입은 實際上의 섞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푸루샤는 本性上 순수한 의식으로서 언제나 자유로우며 프라크르티의 방관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계는無知로 인하여 푸루샤가 붓디로 착각되어 마치 붓디가 겪는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푸루샤가 체험하는 것으로 誤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상키야철학에 있어서의 속박이란 푸 루샤와 붓디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봇디는 사트바의 성질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섭세 한 물질이어서, 푸루샤의 빛을 반사하여 마치 그 자체가 의식이 있 는 존재처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붓디의 상태가 푸루샤 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키야철학에서 말하는 無知인 것이다. 요가철학은 종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를 우리가 봇디의 상태를 마치 푸루샤인 양 간주하는 것 이 無知라 한다. 푸루샤는 본래 純粹 識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며 변화를 겪지 않는 存在이다.
그러나 對象에 따라 변하는 붓디의 비추어진 상태둥과 혼동되기 때 문에 푸루샤자체가 認識과經驗의 主體로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는 것이다. 마치 아무런 형태도 없는 鐵球의 불이 둥근 형 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차가운 칫덩어리가 드겁게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혹은 달이 혼들리는 물결에 비치게 되면 마 치 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며 물 자체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한다. 따라서 푸루샤와 붓디폴 분명히 구별하 는 分別智 v i veka- jii ana 가 解脫에 필 수적 인 요건 이 되 는 것 이 다. 상키야철학에 의하면 이러한 分別智의 가능성은 봇디 자체 내에 서 발견된다. 따라서 프라크르티는 푸루샤의 해방이라는 靈的인 목 적을 위하여 부단히 활동하고 있으며, 프라크르티는 본래 푸루샤를 속박하려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결국 解脫과 束 {광 은 모두 프라크 르티 자체 내의 사건이며 봇디가 그 關鍵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봇디 내에 이러한 分別智가 생기게 되면, 붓디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認識과 行爲도 그치게 되며 푸루샤도 그 본래의 모습인 순 수한 獨存 ka i val ya 의 상태 에 있게 되 는 것 이 다. 『數論碩』의 著者 이슈바라크리쉬나 I§varakrsna 는 말하기를 프라크르티는 매우 수중 은 舞姬와도 같아서, 일단 푸루샤라는 방관자가 자기 춤을 쳐다보 고 있다는 의식이 생기면 춤을 그치게 된다고 한다. 푸루샤는 프라 크르티를 일단 보고 나면 모든 興味를 잃어버리고 프라크르티는 푸 루샤에 보여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요가철 학에 서 는 이 봇디 에 다가 아함카라 abamkara 와 意根 manas 을 포함시켜서 心 citt a 이라 부른다. 心은 그 안에 前生에서 경험 한 經驗들의 자취 samskara 나 印象 vasan 료들, 혹은 業의 功過둘을 지니고 있는 輪廻의 주체로서, 이들 참재적인 힘들이 現世나 來世 에서 적당한 조건들을 만나면 還生하게 된다고 한다· 요가철학은 이 心의 잠재적인 힘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키야철학에서처럼 푸 루샤의 해 방을 단순히 分別智만으로 가능하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 다. 心 속에 참재해 있는 모든 과거의 습관적인 힘들이 재거되어 心이 푸루샤처럼 순수한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습관적인 힘과 業의 자취를 生成
하고 있는 心의 모든 작용들이 그쳐 야만 citta- vrtt i-n ir o dha 解脫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가철 학에 의 하면 心은 다섯 가지 의 습관적 인 힘 혹은 碩腦 klesa 에 의 하여 침 두되 어 있 다고 한다. 죽 無 明 avid y a, 我見 asmi ta, 貧 rag a , 僧 dve~a, 現 貧 : abh i n i vesa9) 인데, 이 중에서 無明의 힘이 가장 크며, 나머지 4 가지 번뇌를 낳게 된다. 이들 번뇌에 의하여 우리 는 業 울 짓게 되며, 우리가 행한 業은 또 心 속에 그자취와영향을 남기게 되어 우리는 후에 그에 相應한 業報를 받게 되는 것이다.
9) 現益이 란 現世의 享樂에 執깝하여 죽음운 두려워 하는 마음운 말한다.
요가철학은 우리의 心作用을 5 種類로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다. 죽 正知 pra mai:i a, 不正知 vip a rya y a , 分別知 vik a lpa , 睦眠 nid r a, 記 憶 smr ti이 다. 正知는 知覺 p ra ty ak~a 과 推論 anumana 과 證言 sabda 의 세 가지 采 當 한 인식의 方法으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不正知는 적극 적으로 믈린 지식을 말한다. 分別知는 對象이 存在함이 없이 순전 히 말에 의해서만 아는 지식, 예를 들면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 고, 睦眠이란 認識의 不在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心作用의 하 나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남겨진 印象을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回想하는 것이다. 이러한 心作用들과 前에 축적되었던 습관적인 힘들을 계거하기 위 하여 요가哲學은 구체 적 인 修行方法으로서 8 가지 단계 로 구성 된 八支 요가 a~ tang a- y o g a 를 제 시 한다. 죽 禁制 ya ma, 勸制 niy am a, 坐法 asana, 調息 pra i:i ay a ma, 制感 p ra ty랴 ara, 執持 dh 쵸 a i:ia, 靜慮 dhy a na, 三昧 samadh i로서 , 이 중에 서 처 음 다섯 은 나머 지 셋을 위 한 준비 단계로 간주되며, 요가의 궁극목표는 모든 心作用이 그 친 三昧 sam 료 dh i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Colebrook, H. T., tra ns., The Sii nk hy a Ki iri k i i ; and H. H. W ilso n, tra ns. , The Bhasya or Commenta r y of Gaudap ad a. Bombay, 1887. Dahlman, J., Samkhy a -Phil o soPhie . Berlin , 1902.
Danie l ou, A., Yog a.· The Meth o d of Re-in t e g r ati on . London, 1949. Dasgu pta, S., The St ud y of Pata n ja li . Calcutt a, 1920. —, Yog a as Plzilo sop lzy and Reli gion . London, 1924. , Yog a Plzil o sop lzy in relati on to Ot h er Sy s te m s of India n Thoug h t. Calcutt a, 1930. Eli ad e, M., Yog a : Immorta l i ty and Freedom. Prin c eto n , 1958. Garbe, R., Die S a11zkhy a -Phil o s0Phie . Leip z ig , 1917. , Samklzya und Yog a . St ra sbourg, 1896. , tra ns., Mondschein der Samkhy a Wahrheit . (Vacasp a ti m i sr a 의 Samkh y a tatt va-kaumud i의 獨 譯 ) . Hauer, J. W., Di e Anfi ing e der Yog a p ra xis . Stu t t ga rt, 1922. , Yog a als Heil we g . Stu t t ga rt, 1932. Jha , G., tra ns., The Yog a sarasaT? Zgr aha of Vij iian a Bhik s hu. Bombay , 1894. Joh nsto n , E. H. , Early Samkhy a : An Essay in its H i st o r ic a l Develop - ment accordin g to the Texts . London, 1937. Keit h, A. B., The SaT?Z k hy a Sy s te m . London, 1918. Sharma, V. H. D., tra ns., The Tatt va kaumudi (Vacasp a ti m i sr a's Commenta r y on the Sa 毋 kh y a-kar i ka) 2nd ed. Poona, _19 34. Wood E., Yog a . Harmondsworth , Eng la nd, 1959. Woods, J. H., The Yog a Sy st e m of Pata i i jali , or the Ancie n t Hi nd u Doctr i n e of Concentr at i on of Mt 'nd . Harvard Orie n ta l Serie s , Vol. 17, 1914. (Yog a -S1Ura, Yog a -Bha$y a , Ta tt va-Va i sarad i의 英譯 ).
제 8 장 勝論學派의 哲學 1 勝論哲學의 傳統 상키 야와 요가哲學이 같이 가듯이 勝論 Va i se~ i ka 哲學 1) 은 보통 正 理 N y a y a 學派의 哲學과 함께 논의되어 왔다. 어느 때부터 이 두 學 派가 같이 취급되게 되었는지는 확실· 히 알 수 없으나, 두 학과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世界觀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서로 相 資관계를 이루어 온 것으로 보아 왔다. 勝論학파는 주로 世界의 形 而上學的 構造룰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파인 데 반하여, 正理학파는 이 形而上學的 世界觀을 論理學과 認識論을 동하여 뒷 받침 해 주는 학파이다. 인도의 다른 모든 정통학파들이 佛敎를 비판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학파는 극단적인 實在論的 立場을 대표하는 哲 學으로서 佛敎의 哲學的立場과 정면으로 대립하여 왔다. 勝論과 正理는 비목 바라문계의 正統六派로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상에 있어서 이 두 학파의 正統性은 오히려 다분히 名目的인 것이다. 베단타나 미망사, 그리고 상키야·요가학파가 분명히 베 다의 哲學的 思想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勝論과 正理學派는 베
1) 〈 Va i se l?i ka 〉란 말은 〈特殊〉, 〈區別〉 등을 의미하는 〈vi §esa 〉라는 말에서 온 것으 로서 이 학파가 세계를 6 범주로 區別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생긴 이음이다. 그러 나 中國의 佛敎傳統에서는 〈 Va i se l?i ka 〉란 말윤 〈뛰어나다(殊勝)〉의 뜻으로 이해 하여 이 학파운 勝論이 라고 불러왔다. 本압에서는 이 用法운 그대로 따온다.
다나 그 후의 종교적 문헌들인 叔 甫詩 나 푸라나 Purana 같은 것 에 서도 분명히 그 기원을 찾기 어려운 哲學 이기 때문이다 .2) 우선 勝論학파의 주요 哲 底 的 文 獻 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카나 다 Ka l). ada 라고 하는 아마도 가공적 인물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 勝論經 Va i se~ i ka-su t ra 』으로부터 시 작한다. 그 연 대 는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서력기원 1~2 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내용은 극히 간결한 격언조로 된 철학적 진술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다른 학파 의 근본경전들처럼 주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 분 들이 많 이 있다. 勝論 哲 學 의 결정적인 체계적 정립을 한 것은 서력기원 500 년경 에 씌 어 진 포라샤스타파다 Prasas t a p ada 의 『句 義法綱要 Padar- t ha -dh arma-sam g raha 』로서 , 형 식 상으로는 『 勝論經 』에 대 한 주석 으 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論 書 아다 .3) 프 라샤스타파다의 論 書 에 관해서는 뵤마쉬바 V y omas i va(900~960 년경)의 『如虛空 V y omava ti』, 슈리 다라 Sr1dhara(950~1000 년경)의 『正 理 色 蒸 樹 N y a y akanda 1!』 그리고 우다야나 Uda y ana(1050~1100 년경)의 『光 陣 連 紹 K i ra l). avan 』와 같은 주석 서 들이 씌 어 졌 다· 또한 이 무렵 勝論 과 正理哲 學 울 함께 섞어서 취급하는 쉬바아디티야 S i vad ity a 의 『七 句 義論 Sa pta p adar t h1 』도 씌 어 졌 다. 4) 이 제 『 勝論經 』과 프라샤스타파 다의 『句 義 法綱要』를 中心으로 하여 勝 論 哲 學 의 大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D터勝 i e論유 P哲래h學되il 었의os o운 p기 h 원것 ie 이에d e라 r관 는 l하n d여諸e學는r ( 說S쟈 tu 이등tt이나g a 敎 r있t ,: 으 A順나lf世 r 모e派d 두 KL o확rok실anye치 ra tVa 않, e 다rl혹.ag 은 ,H 1.미9v7.암 4 G)사, lap 學spe. 派 n2a로3p4 p 부~, _ 37 참 조 . 3) S. N. Dasg upta, A Hi st o ry of India n Phil o sop h y , Vol. I, p. 306 脚注 참조. 4) 이 이 외 에 도 同 類 의 著암 로서 Kesavam i sra 의 Tarkabhii ~ii, Annambha tt a 와 Tarkasamg r aha 등이 그 후 에 씌 어 졌 다.
2 六範鶴 勝論哲 學 은 世界풀 여 섯 가지 範 ~ p adar t ha( 句 義 )로 區 別하여 分 析한다. 여기서 범주라 함은 단순히 抽 象 的인 觀念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이 觀念들에 해당하는, 실제로 存在하며 言 表할 수 있
는 知識 의 對象울 지칭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서 勝論哲學 은 世界 믈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범주는 實體 drav ya 다. 質體란 거기에 어떤 性質이 나 行爲 가 속할 수 있는, 죽 性質이냐 行 爲 의 根底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이 다· 또한 質體는 어떤 물건들의 質料 的 原因이 되는 것이다. 勝論 에 의 하면 官體 에 는 9 가지 가 있 다. 즉 地 pr th i v i , 水 ap , 火 ag n i, 風 vay u , 空 aka§a, 時間 kala, 空間 dis , 意根 manas, 自我 a t man 이 다. 地, 水, 火, 風, 空은 5 가지 物質的 要素 p a fi ca-bh iit a 로서 , 5 가지 외적 감각기관에 의하여 각각 지각될 수 있는 고유의 特殊性 質 v i §esa_ g una 둘을 지 니 고 있 다. 예 를 들면 홍은 코에 의 하여 지 각되는 냄새의 성질을 지녔고, 空온 귀에 의하여 지각되는 소리의 성질을 지녔다고 본다. 地 ?k • 火 • 風온 그것들을 구성하는 미세 한 원자 p arama i:i u 둘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한다. 이 원자들은 무수히 많으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도 없고, 生成도 될 수 없고 파괴도 될 수 없는 영원한 nit ya 存在들인 반면 에예, 영이원들하로지 구못성하된다 地an·it y水a . ·火勝·論 風에은 의 하생성면 ·원소자멸에될는 수地 있• 水기 • 때*문 . 風을 구성하는 異質的인 4 가지 종류가 있고, 개개의 원자들도 각 각 量 과 質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한다. 空 탸 asa 은 원자로 구성 되어 있지 않다. 勝論에 의하면 實體 가 외적으로 지각되려면 크기 와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야 하는데, 空은 그렇지 않으므로 지각 될 수 없다· 그러나 소리라는 성질이 속해야 하는 어떤 실체로서 그 存在가 추리되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時間 kala 과空 間 d i s 온 空과 마찬가지로 지각될 수 없고 추리로 아는 실체들로 서, 각각 하나이며 영원하고 모든 것에 通在하는 것이다. 즉 시간 은 우리가 과거 • 현재 • 미래 • 젊음 • 늙음 등을 인식하는 근거로서, 공간은 〈여기〉, 〈처기〉, 〈가깝다〉, 〈멀다〉 등을 아는 인식의 근거 로서 추리된다. 空과 時間과 空間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통일 적 실체들이지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제한적 條件들 up ad hi 때문에 다수의 부분적인 존재들인 것처럼 흔히 말하여진다고 한 다. 예를 들면 房이라는 제한적 조건 때문에 房의 공간이라는 개념
이 생겨, 원래는 하나인 공간이 마치 부분적인 존재들로 인식된다 는 것이다. 自我 atm an 혹은 영혼은 우리의 의식현상의 밑바닥을 이루는 실 체로서 영원하고 通在的이다. 영혼에는 개인영혼 ji va t man 과 최고 영혼 par atm an, 죽 神 Isvara 의 두 종류가 있다. 神은 하나이며 세 계의 창조자로서 추리되는 존재이다(神의 存在證明은 正理哲學에서 다룰 것임). 神은 全知한 영혼으로서 모든 고통과 욕망으로부터 자 유로운 존재이다. 개인영혼은 하나가 아니라 많으며, 그들이 속한 몸에 따라 각각 다른 特殊性 v i se~a 을 갖고 있 다고 한다. 개 인 영 혼 은 意根 manas 과 관계되 어 있지 만 않는다면 본래 神과 같이 고 통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라고 한다. 영 혼은 意志, 欲望, 기 쁨, 아픔 등의 여러가지 정신적 상태들이 속하는 實體로서, 〈나는 안다〉, 〈나는 원한다〉 등의 表現으로부터 우리는 自我가 意識이 속· 하게 되는 바의 實體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勝論哲學 은 상키 야나 베 단타哲學과는 달리 識 cit을 영 혼의 본질 적 인 性格으 로 보지 않고 우연적인 성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깊은 수면의 상태에 빠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識의 성질을 갖지 않~ 다고한다. 마지막으로 勝論哲學은 意根 manas 이라는 것을 독립된 實體로. 인정한다. 意根은 우리의 내적 감각기관 an t ar i ndr iy a 으로서, 勝論 에 의하면 우리의 외적 감각기관들이 외적 대상들을 지각하듯이 영혼의 여러 상태들과 같은 내적 대상들을 지각하는 어떤 내적 감 각기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意根인 것이다. 죽 우리의 自我는 외적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계의 事物들과 상대하 며 意根이라는 내적 감각기관을 통하여는 自身의 상태들을 인식~ 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외적 감각기관들은 항시 그 대상들과 접 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이 동시에 다 지각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각활동을 한 번에 하나씩으로 제한하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것이 意根의 기능으로서, 지각이란 意根의 · 注意가 감각기 관을 동해 서 들어 오는 대 상으로 향해 져 야만 비 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意根은 감각기관을 동하여 들어오는 대상 세계
와 자아와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통하여 자아는 대상 과 접촉을 하며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意根은 일종의 미세한 原子와 같아서 아무런 部分을 갖고 있지 않는 영원하고 동일적인 존 재 라고 한다. 만약에 마나스가 部分울 갖고 있다면, 그것의 활동도 分化될 수 있으며 우리는 많은 대상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각 自我는 각자의 意根과 관계하고 있으 며 이 意根이 우리의 自我에다 個體性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意根은 輪廻의 과정을 동하여 自我폴 동반한다고 한다. 지 금까지 우리 는 勝論哲學의 6 범 주 가운데 서 實體 dravya 의 개 념 을 살펴보았다. 勝論哲學의 둘째 범주는 性質gu na 이다. 성질은 언 제나 實體에 속하여서만 존재하며 그 자체는 아무런 성질이나 行爲 를 갖고 있지 않다. 성질은 어떤 사물의 性格이나 本性은 결정할 수 있으나, 그것의 존재와는 무관하다· 또한 행위와는 달리 性質은 실제의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이고 靜的인 속성이다. 勝論은 가장 기 본적 인 性質을 24 種 (색 , 말, 數, 延長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各種을 더욱 더 세분하여 고찰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勝論은 세번째 범주로 行爲, 혹은 運動 karma 을 든다. 行爲는 性質과 마찬가지로 실체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나, 性 質과는 달리 한 실체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他 실제와 접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원리이다. 行爲는 물론 어떤 性質도 갖 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性質은 실체에만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空, 時間, 空間이나 靈魂과 같은 通在的인 실체들은 운동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제한된 物體的 實體, 죽 地, 水, 火, 風, 意根에 만 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無制限한 것은 위치를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勝論은행위를다섯 가지로 분류 하는데 上投 ut k !_ie pa l). a , 下投 avak!_i e p a l). a , 屈 akuncana, 伸 pra sarai;i a, 行 ga mana 등이댜 네번째 범주는 普過 saman y a 이다. 죽, 한 사물을 다른 이픔이 아닌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공동적이고 본질적인 實在를 말한다. 唯名論的인 견해와는 달리 勝論에 의하면 보편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事物에 內在하는 1 t1f이 다· 보편 은 個物에 내 재 하며 그물이 가지 는 공통성에 대한 관념, 즉 類개념의 기반이 된다· 보편은 그 범위 에 따라 가장 높은 보편, 죽 有性 sa tt a 의 개념과 가장 낮은 보편, 죽 고양아性같이 一類의 사물 안에 국한된 보편, 그리고 높지도 않 고 낮지 노 않은 보편 , 예 를 들면 實體性 dravy a t a 과 5) 같은 것 으로 구분된다. 普通온 實體와 屬性과 行爲의 범주에만 內在한다 .
5) 마찬가지 로 性質 gu na 됨 , 行爲 karm 태 도 아 런 부유의 類槪念이 다.
보편이 사물의 공동성을 설명해 주는 것임에 반하여 勝論의 5 번째의 범주인 特殊性 v i se !i a 은 부분을 갖지 않는 영원한 실체들 즉, 時間, 空間, 空, 意根, 磁 魂, 原子 등의 궁극적 인 特殊性 혹은 차 이점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부분을 갖고 있는 사물들의 차이점은 부분들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이 되지만, 부분이 없는 실체들의 차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에 의하여야만 설명이 된다 고 한다. 아 특수성은 영원한 실체들 속에 존재하므로 그 자체가 영원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勝論철학은 內在 samava y a 라는 범주의 質在性을 말한 다. 勝論에서는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 하나는 連結 sarhy o g a , con j unc ti on 이 고 다른 하나는 內在 samavay a , i nherence 이 다. 연결 이 란 한 사물과 다른 사물 사이 의 잠정 적 인 외 적 관계로서 그것이 없어도 그 사물은 존재할 수 있다. 연결이 란 다 라서 두 실제들이 가지는 우연적 성질 혹은 속성으로 간주된다. 반 면에 내재의 관계는 영구적이고 不可分離의 관계로서 全體와 部分, 實體와 性質들과 같이, 하냐가 다몬 하나 안에 필연적으로 내재하 는 관계인 것이다. 內在는 勝論에 의하면 지각될 수 없으나, 正理 哲學에서는 지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 외에도 『勝論經』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 만 10 세 기 이 후의 勝論哲學의 著 書 둘은 일 곱번 째 의 범 주 pa darth a 로서 不存 abhava 을 들고 있다· 무엇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否 定할수 없는 實在의 한 면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과 言語 pa da 는 대상 ar t ha 이 있게 마련이며 대상은 지식과는 별도르 독립적으 로 존재하므로 不存이라는 것도 不存을 아는 지식과는 별도의 객관
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勝論哲學은 네 가지 종류의 不存을 구명한 댜 첫째는 前不存 pr ag a bhava, 죽 어떤 事物의 生成 이전의 不存이 댜 둘째 는 後不存 pr adhvamsabhava, 죽 事物의 파멸 후의 不存이 며 , 세 째 는 相互不存 any o ny a bhava, 즉 한 사물이 다른 어 떤 사물로 存 在하지 않음으로써 의 不存이 다. 네 째 는 絶對不存 aty a nta b hava, 죽 〈토끼 의 뿔〉, 〈허 공의 꽃〉 等과 같은 不存이 다. 前不存이 없 다면 모 든 事 物둘이 시작이 없을 것이고, 後不存이 없다면 모든 사물이 영 원할 것이고, 相互不存울 否認하면 사물들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며 絶對不存이 없다면 모든 事物들아 항상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不合理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勝論哲學은 이상과 같은 7 가지의 범주 둘을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親念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가 알아야 하는 知識의 객관적인 대상 p adar t ha 으로 여기는 것이 다· 그들은 實在의 7 가지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勝論哲 學온 이 範時論에 의하여 多樣한 世界의 모습을 抱振하고 있는 多 元的 實在論의 哲學이 다. 상키 야哲學의 二元論이 나 베 단타哲學의 一元論的인 世界競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神, 不可見力, 解脫 勝論哲學도 印度의 전동적 세계관인 세계의 주기적인 창조와 해 체를 받아들인다. 원자들의 결합과 해제에 의하여 물질세계는 창 조되고 해체되는 것이다· 초기의 勝論思想온 神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은 듯하나 후에 와서는 세계의 道德的 性格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6) 죽 원자의 결합과 해체는 맹목적이고 우연적 인 과정 이 아니 라 온 우주의 大主宰者 Mahesvara 인 신의 창조 와 파괴의지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의지는 도덕적인 경륜을 배려 하여 〈不可見力 adr~ t a 〉이라고 불리는 개인영혼들의 보이지 않는
6) 프라샤스타파다의 『句義法綱要』에 서 처 음으로 분명 하게 세계문 장조하고 과괴하 는 大主宰神 Mahesvara 의 개 념 이 나타나 있으며 , 그후 우다야나와 슈리 다라 등 의 주석서 등에서 有神論的 思想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도덕적 功過에 따라서 그들에게 합당한 경험을 하도록 원자들의 운 동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神은 이 영원한 원자들을 창조하지는 않 았지만 知性을 결여한 맹목적인 원자들을 도덕적 법칙에 따라 움직 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神은 세계의 能動因이며 質料因은 아니다. 勝論哲學에 의할 것 같으면 원자는 그 자체로서는 운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개인의 영혼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不可見力에 의하여 운동아 전달된다고 한다· 그러냐 이 不可見力 그 자체도 지성이 없는 맹목적인 존재이기 때문예, 결국 知性的인 神이 있어서 원자들의 운동을 도덕법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렇게 보면 원자론에 입각한 勝 論 哲 學 은 西洋哲 學 에서처럼 唯物論的인 결론으로 가지 않고 인도인 일반이 가졌던 도덕적 세계 관에 적응하는 有神論的 원자론울 전개한 것이다. 인도의 다른 모든 학파들과 마찬가지로 勝論哲 學 도 自我의 해방 에 그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自我의 해방이란 自我가 아무런 속성 이나 성질들을 지니지 않고 순수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또한 그 안에 來世에서의 業 報롤 초래하는 어떠한 不可見力도 남아 있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勝論哲學에 대한 울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自我의 본성이나 원자의 아론등을 바로 알면,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욕망과 행 위들을 제거하게 된다고 한다. 勝論哲學은 인간의 행위를 자발적인 것과 자발적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며, 자발적인 행위는 欲望 icc ha 과 嫌惡 dve~a 에 근거한 행위로서, 이것만이 도덕적인 의미를 지닌 다고 한댜 解脫이란 이러한 자발적인 행위가 모두 그쳐서 새로운 도덕 적 功過 dharma, adharma 가 축적 되 지 않고 과거 에 축적 된 功 過가 서서히 盡 하여 버린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自我는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느끼지 않고 어떠한 의식..5:.. 없는 상태가 된다· 모든 속성을 떠나서 실체로서의 自我가 그 자체~서 존재할 따름인 것이다. 勝論哲學의 認識論은 現 量 , 죽 知礎 p ra ty ak~a 과 比 量 , 죽 推論 anumana 을 지식의 두 가지 타당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베다의 권위 는 인정하지만 正理학과처럼 베다를 하나의 독립적인 타당한 지식
의 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베다에 나타난 진술들의 타당성은 그 著者둘의 권위적인 성격으로부터 추론된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聖敎 批 sabda 은 추론의 일종인 것으로 간주된다. *잠고문현 Bhaduri, S., Stz e di es in Ny a y a -Vais e §ik a Meta p h y s ic s . Poona, 1947. Chatt er ji, J. , Hi nd u Reali S1n . Allahabad, 1912. Goug h , A. E., tra ns., The Vais e §ik a Sutr as of Kanada. Benares, 1873. Faddeg o n, B., The Vaif e§i ka Sy st e m . Amste r dam, 1918. Handt, W., Di e At om i sc he Grundlag e der Vais e § ika p h il o sop h ie . Ro s- to ck, 1900. Keit h, A. B., India n Log ic a nd At om i sm . Ox for d, 1921 . Mi sh ra, U., Concep tion of Matt er accordin g to Ny a ya -Vais e §ik a . Allahabad, 1936. Patt i, G., Der Samavaya . Roma, 1953. Pott er , K, H. , ed. , India n Meta p h y s ic s and Ep iste m olog y: The Tradi- tion of Ny a ya -Vais e §ik a up to Gaiz ge sa. Prin e cto n , 1977. Roer, E. , tra ns. , Vais h eshi ka -Sii tra , Zeit sc hrif t der Deuts c he11 Morge 11lii1 1d is c hen Gesellschaft 21 (18 67) . Sin h a, J., India n Reali sm . London, 1938. Ui, H., tra ns., and F. W. Thomas, ed., The Vais e § ika Ph i loso p h.『 accordin g to tlze Dasop a darth a -sastr a : Chin e se Te 챠 with Intr o duc tion , Translati on , and Note s . London, 1917. 宇井伯 壽 , 『印度哲 穆 硏究.!l, 第一, 第三卷.
제 9 장 正理學派의 哲學 1 正理哲學의 傳統 正理 N y a y a 學派의 철학체계는 전통적으로 가우타마 Gauta ma 혹 은 眼足 Ak~a 函 da 이라는 사람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의 정확 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서력기원전 1~2 세기의 사람으로 추 정되며, 현재의 『正理經 N y a y a-s iit ra 』은 기원후 2 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正理經』에 대한 현존하는 社釋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며 권위있는 것은 밧샤야나 Va t s yay ana(450~500 년경)에 의한 『正理疏 N y a y a-bha~ y a 』이며, 이 疏는 그후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많은 다른 주석서둘을 낳았다. 비목 『正理經』은 2 세기 전후에 씌어졌다고 하나, 올바른 사고의 형태와 논중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학파의 연원은 훨싼 더 멀리 소급된다고 볼 수 있다. 正理 n y a y a 란 말은 아마도 원래는 베다시대 이후에 점차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제식의 올바른 규범을 추리해내고 논증하는 것을 의미했다. 天文, 文法, 法律 등과 같은 인도의 많은 학문들이 베 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것과 같이 正理學도 원래는 베다의 연구와 관 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미맘사 M i mamsa 학파가 祭式의 문 제믈 전문적으로 다룸에 따라 正理는 학문의 일반적인 논중방법만 울 추상적으로 다루는 形式論理學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正 理는 다른 이 름으로 思擇 ta rka 혹은 尋究 anv i k 혼i k i라고도 불리 었
다. 우리 는 『가우타마法典 Gau t amadharma-su t ra 』, 『마누法典 Mana- vadharma-sas t ra 』, 카우 틸 리 야 Kau tily a 의 『'.f'.t利論 Ar t ha-sas t ra 』과 같 은 古代文獻들에서 그러한 학문의 공부가 政治나 法의 遂行을 위해 서 권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밧샤야나의 『正理疏』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 세기 경의 웃됴다카라 Udd yo t akara 에 의해서 씌어진 『正理評釋 N y a y a-var tti ka 』으로서 웃됴다카라는 佛敎의 世親 Vasubandhu 과 陳那 Dig na g a 의 說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반박하고 있다. 이후 약 300 여년간에는 正理학파의 처술로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별로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샨타락시 타 San t arak~ it a 나 카말라쉴라 Kama- as i la 와 같은 8 세기의 불교철학자들의 처서를 통하여 이 동안의 正 理학파 사람들의 견해를 엿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正理哲學의 중 요한 인물로는 印度西北部의 카쉬미르地方 출신인 브하사르바츠나 Bhasarvaji' ia ( 850~920 A. D. ) 가 있 다· 그의 처 서 『正理精要 N y ay asara 』 는 正理哲學을 간략히 요약해 주는 대표적인 처서이고 그의 『正理 裝飾 N y a y abhu~a 1_1 a 』은 『正理精要』에 대 한 주석 으로서 正理학과 내 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大著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발 견되어 學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D 正理哲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파들의 哲學에도 대표적인 저술들을 남긴 바차스파티미슈라 Vacas p a ti m i sra(9 세기 )2) 는 웃됴다카라의 『正理評釋』에 대한 주석서인 『正理評釋眞意注 N y a y avar tti ka- t a tpa ry a p ka 』를 썼고, 우다야나 Uda· y ana(l050~1100) 는 이 社에 대한 復社로서 『正理評釋眞意社解明 N y ayavar tti ka- t a tp a ry a ti ka- p ar i suddh i』를 썼 다. 우다야나는 많은 現代 의 學者들에 의하여 正理와 勝論哲學의 가장 위대한 哲學者로서 간 주되 고 있 다. 그의 다른 著 書 『 自 我眞理分別 A tm a t a ttva v i veka 』은 佛 敎의 無我說에 대한 批判으로서 自我의 存在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正理 花束 N y a y akusuma iij a li』은 냐야-바이쉐시 카 哲學에 있어 서 神의 存在의 증명에 대한 決定的인 처술로 여겨지고 있다. 우다
1) Karl H. Pott er , ed. l11dia 11 Meta p h ys ics and Ep iste m olog y. (Ne w Jer sey: Prin c eto n Univ e rsity Press, 1977 ), pp. 6, 410~24 장조. 2) Vacas p a timi sra 의 年代에 관해서, 同上, pp.4 53~4 창조`
야나의 哲學 은 그 후 냐야- 바 이 쉐 시 카 학파 를 風條하다 가 14 세 기 에 와서 간게 샤 Gan g esa 가 출현하 여 Ii' 低理 如 意珠 Ta tt va ci n t ama i;ti 』 라는 論理線법률 써서 소위 新 正 理學 Nav y a-n y a y a 의 기초 륭 수립 했 다. 荊 正理 卑 온 주로 까다롭고 기술적인 論理 의 문제 들을 중점적 으로 연 구하는 形式 論 理학파로서 여 기 서 는 다루지 않기 로 한다. 2 知 識 의 意味와 方 法 『正理 經 』은 正理哲 學 이 다루어 야 할 문제 들을 16 가지 로 분류하 여 언급하고 있다. 참된 지 식 의 手段인 批 pra mai:i a, 지 식 의 대 상인 所鉛 pra mey a , 불확실 한 의 심 의 상태 인 疑 惑 samsay a , 討 議 가 지 향하거 나 괴 하 려 는 目的 pr ay o ja n a, 추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例 dr~ta n ta , 옳 다 고 받아들이 는 定 說 sid d hanta , 추리 의 5 가지 단계 를 구 성 하는 명 제 들인 支分 avay a va, 가설 적 논법 을 통한 論破 tar ka, 正 當 한 論 議 몰 통하여 도달한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決定 nir i: i ay a , 인식의 수 단과 논리의 전개를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려는 論議 vada, 승리만 을 일삼는 不正한 論 爭 jal pa , 상대방의 논파만을 목적으로 하는 論 誌 vit an da, 추리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같이 보이나 사실온 들린 似 因 hetv a bhasa, 상대 방의 주장이 나 논리 를 왜 곡시 켜 비 난하는 誰辯 cbala, 상대 방을 혼란시 키 는 부당한 論 難 인 誤難 jat i , 논쟁 에 있어 서 상대 방을 敗하게 만드는 약점 혹은 負 處 nig r aba-sth ana 동이 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正理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 보다도 認識과 論 理展開의 問 題 들임을 알 수 있다. 勝論철 학에서 말하는 7 가지 범주는 모두 2 번째의 것, 죽 所 量 p rame ya 에 포섭 되 며 , 正理哲學은 이 所 量 보다는 蘇 p ramana 에 더 많은 관심 을 기 울이는 철학이다. 正理哲 學 은 知 識 jii ana 을 認 知 up a labdhi, ( 혹 은 anubbava; ap pr ehen- s i on) 로 정의하며, 모든 지식은 대상의 啓示나 나타남 arth a p r akaso_ buddh i이라고 한다. 지식은 自我가 自我가 아닌 것, 죽 대상들과 접 촉할 때 생기는 것으로서, 自我의 본질적인 성품은 아니다. 타당한
지 석 p rama 은 대 상윤 있는 그대 로 인 지 하는 것 yat h a rth a -anubhava 이며, 진리란 대상과의 일치를 말한다. 올바론 인식은 성공적인 행 위 p ravr tti -samar t hy a 로 이 끌며 , 그릇된 인 식 은 실 패 와 실 망으로 이 끈다고 한다. 正理哲學에 의하면 인식의 옳고 그름은 자명한 것이 거나 혹은 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품이 아니라, 일단 지석이 생기고 난 후에 대상과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라 별도로 알 려지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진리의 내용은 대상과의 일 치이고, 진리의 시험기준은 성공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正理의 인 식론은 따라서 實在論的이고 實用主義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正理哲學은 采當한 知識 p rama 의 手段 p rama l_l a 으로서 現量 혹은 知登 pra ty ak ~a; pe rcep tion , 比景 혹은 推論 anumana; inf e r ence, 폄 n 兪 量 혹은 比校 up am ana; comp a ri so n, 그리 고 聖敎量 혹은 證言 sabda; t es ti mon y을 認定한다. 이 들을 동하여 얻은 지 식 은 대 상에 관한 확실 하고 충실 한 오류가 없는 지 식 이 며 , 疑心 samsay a , 誤霧 vip a ry a y a , 假說的 論破 t arka 나 혹은 記憶 smr ti에 의 하여 얻 은 采當치 못한 지 식 a p rama 과 구별해야 한다. 의심이란 확실치 못한 지식으로서 타 당한 지식이 못 되며, 오류란 확실한 지식이 될지언정 대상에 충실 치 못한 지식이다. 假說的論破란 예를 들면 〈만약에 불이 없으면 연기가 안 났을 것이다〉라는 형식의 가설적 논증으로서 자기가 이 미 推論, 죽 〈연기가 있으니까 불이 있다〉라는 추리폴 통하여 얻은 지식을 옹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지 식을 提供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불이 있다〉라는 사실은 추론을 통 하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적 논파는 采當한 지식 이 못 된다고 한다· 記憶이 란 대상에 관한 直接的인 지식을 주지 않고 단지 과거에 가졌던 지식을 再現시켜 주기 때문에 타당한 지 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과거의 타당한 지식을 再現 시켜 주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自體가 타당한 기억 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正理哲學에서 말하는 타 당한 지식이 란 이미 언급한 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認知 anubhava 하는 것으로서, 기억에 의한 再現的 지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采 當한 지 식 p rama 이 란 지 각과 추론과 비 교와 중언의 4 방법 pra mal) a
을 동한 대상의 認知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4 가지 方法응 하나하나 考察해 보자. 3 知覺의 理論 正理哲學은 知 1 t p ra ty ak 흥 a 을 두 種類로 구분한다. 하나는 普通 !aukik a 知礎이요, 다른 하냐는 特殊 alaukik a 知覺이 다· 보 통 지 각 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참다운 지각 을 말 한다. 우리의 감각기관에 여섯이 있으므로 보몽 지각도 여섯 種類 가 있 다. 죽 眼, 耳, 鼻, 舌, 身의 다섯 가지 外的 감각기 관 bahy a - i ndr iy a 과 각각의 대 상들과의 접 촉에 서 부터 생 기 는 視覺 cak~u~a, 聽 登 srauta , 奧登 gh rai:i ai a , 味礎 rasana, 觸登 s p arsana 이 있 고, 여 섯 번째의 감각기관으로서 마나스 manas;, 죽 意根 이라는 內的 기관 an t a ri nd riy a 을 통하여 自 我의 여 러 상태 들, 죽 욕망, 형 오, 쾌 락, 고동, 지 식 等울 지 각하는 內的 manasa 知登이 있 다. 외 적 감각기 관들은 각각 그들에 의하여 지각되는 대상들의 物質的 요소들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생 각한다. 意根 manas 은 物質的 요소 bh ii.t a 들에 의 하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 외적 기관듬처럼 어 떤 한 종류의 사물의 인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종류의 지 식에 共通的이고 中心的인 역할을 한다. 正理哲學에 의할 것 같으 면 우리의 외적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할때면 반드시 意根이 먼처 그 감각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 서는 意根이 인식주체인 自我 a t man 와 접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 여 意根은 自我와 감각기관들 사이의 중개자와 같은 것으로서, 意 根과 감각기관을 동하여 외적 대상은 自我에 印象울 남기는 것이 다. 지각적 지식은 自我의 상태 혹은 속성인 것이다. 正理哲學은 普通知登의 두 단계 혹은 두 樣態를 구별한다. 즉 無 分別的 nir v ik a lpa , ind ete rmi n ate 지 각과 分別的 savik a lpa , dete r-mi n ate 지각이다. 無分別的 지각이란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성격 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판단 없이 감지하는지각인 데 반하여, 分 別 B9 지각은 대상을 그 성격에 대한 의식과 판단을 가지고 지각하
는 것을 말한다. 분별적 지각은 무분별적 지각의 후에만 이루어지 는 것 이 라 한다. 正理哲 學온 再認識 pra ty ab hij iia, re- co g n it ion , 죽 어떤 대상을 전에 지각했던 무엇으로 인지하는 것도 또 한 종류의 지각으로 간주한다· 特殊 alaukik a 知覺이 란 그 대 상이 特別한 것 이 어 서 보통의 지 각과 는 달리 特別한 수단을 통하여만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것이다. 正理 哲學은 아 러 한 特殊知 8문 에 3 種울 들고 있 다. 첫 째 는 普通相 samany a - J ak~a 1_1 a 의 지 각이 다· 普週相 이 란 한 類에 共通된 性質 혹 은 普通的
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普還相 의 지각을 동하여 우리는 한 類에 속한 特殊한 事物둘 이 갖고 있는 一般的인 性格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正理哲 學 에 의하면 普通은 特殊 안에 內在하고 있는 實在이 다. 3) 따라서 事物 의 지 각에 서 우리 는 特殊만을 지 각할 뿐만 아니 라 이 와 더 불어 特殊들이 갖고 있는 普進的 性質인 普運 相도 지 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지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의 特殊한 모습이나 성품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재하여 있는 人間性 一般도 독수지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다· 두번째 종류의 특수지 각은 知相 j五 ana- J ak!)a 1_1 a 을 동한 지 각이 다. 우리가 흔히 〈독이 무거워 보인다〉 혹은 〈얼음이 차가와 보인 다〉라고 말할 때 〈무겁다〉, 〈차다〉는 눈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나 그렇게 말한다. 이러한 지각은 과거에 가졌던 찬 얼음의 지식을 매 개로 하여 현재의 얼음이 차다고 보는 것으로서 一種의 特殊知覺 이라 한다. 세번째로 正理哲學은 요가의 修練 y o g료 bhy asa 에 의하여 얻어진 神通力에 근거하여 과거와 미래의 사물들, 혹은 極微하거나 숨겨진 것들을 直競的으로 지각하는 지각을 목수지각으로 들고 있 댜 요가에 의한 yo g a j a 지각인 것이다.3) 正理哲學은 普通的 屈性 가운데 客觀 h :) 으로 事物 에 內在하여 賀在하 는 것 j a ti과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附加된 것 up a dhi, 죽 實在하지 않는 것과문 구별한다.
4 推論의 理論 正理哲學은 두번째 의 認識의 방법 으로서 推論 anumana 을 들고 있
다. 推 訖 c:1 관한 이몬은 正理哲學의 證『 議 該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 룹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正理哲穆은 추론의 타당성을 옹호 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추론 이란 우리가 직접 지 각 하 지는 못했 지만 어떤 表徵 li n g a 윤 보 고서 그 표정과 普通的 周延關係 v y a pti를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것 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 산에 불 이 나 고 있다. 왜냐하면 연기가 나고 있기 때문이며; 연기가 있는 곳에 는 불이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것이다. 즉 연기라는 표칭울 보고 불의 존재를 추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추리에 있어서 산을 小 名辭 pa ksa, mi no r ter m, 불을 大名辭 sadhy a , majo r ter m, 표칭 이 되 는 연 - 기 는 中名 辭 ling a , mi dd le t er~ 라 하며 , 이 中名辭는 小名 辭와 大名 辭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서 理由 he t u 라고도 부른다. 위에 든 예 는 우리가 혼자서 추리할 때 생각하는 爲自 比 量 svar t ba-anumana 의 과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서, 他人을 위하여 정식으로 추론을 전개하는 爲他比鹽 p arar t ha-anumana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명 제 들을 갖추어 야 한다 (五支作法) : ® 宗, 죽 主張 p ra tijii a- 산에 볼이 있 다. ® 固 즉 理由 be t u- 연기가 나기 때문이다. ® 幅 죽 例 udahara i:i a 一연기 가 나는 곳에 는 모두 불이 있 다; 예 를 들면 아궁이에서처럼. ® 合, 죽 適用 u p ana y a- 이 산에 도. 연기 가 난다. ® 結 즉 結論 n ig amana 一그런고로 이 산에는 불이 있다 . 4)
4) A ri s t o t eles 의 三段 論法 에서는 @ 죽 大前提륭 먼저 드나, N ya y a 哲 學 에서는 결 온부터 언저 든다. 혹은 Ar i s t o t eles 의 三段 論法 은 ®과 ®룽 생 략한 것 이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리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 이, 〈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라는 보편적 진리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성립 안되면, 〈이 산에 불이 있다〉라는 결론적인 추 리는 타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챠르바카 Carvaka 의 회의론적 철학이 바로 이 점윤 인정하지 않으므로 추리를 인식 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正理哲學은 이 점
을 감안하여 추리의 근거 he t u 와 추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 sadhy a ' 와의 돌림없는 問延관계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우선 正理哲學에서 말하는 이 普過的 周延關係 vy a pti의 개념을 종더 세 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5) 周延관계란 두 事物 r버 에 한 사 물이 다른 사물에 의 하여 포섭 될 때 成立되 는 相關關係를 말한다. 포섭된다는 말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의하여 언제나 同半된다는 것을뜻한다. 예를 들면, 불은 연기에 항시 동반하므로 불은 연기를 포섭 하는 것 v y a p aka 이 며 연기 는 불에 의 하여 포섭 되 는 것 vy a py a 이 다· 그런데 연기는 반드시 불에 의하여 포섭되지만 불은 연기에 의 하여 반드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불덩어리의 鐵球는 연기가 없으며 마른 연료가 탈 때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 경우 의 兩者의 相關關係는 어떤 條件 u p adh i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것은 周延관계 vy a pti라 부르지 않는다· 오직 한 사물 이 다른 사물을 항시 無條件的으로 포섭하는 경우만을 보편적 관계 라 한다. 이와 같이 A 는 B 를 반드시 포섭하나 B 는 A 를 반드시 포섭하지는 않는 경우의 A 와 B 의 상관관계를 不等周延關係 asama- vy a pti라 부른다. 이에 反하여 兩者가 반드시 서로 포섭하고 포섭되 는 경우의 상관관계를 等價周延關係 sama- vy a pti라고 한다. 예를 둘 면, 〈모든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물은 알 수 있는 사물이다〉라고 할 때 〈이폼을 댈 수 있는 것〉과 〈알 수 있는 것〉과는 等價周延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5) 여기서 周延關係란 論 理學에서 보.몽 사용하는 대로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운 나 고타도내 는번 역것이할 수아 니있라다 .사 울과 사울사이의 관계융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這充關係라
다음의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普過的 周延關係몰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연기와 불과의 보편관계는 물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들에 의거한 歸納推理에 근거하고 있다고 正理哲 學은 認定한다. 正理哲學에 의할 것 같으면 귀납추리는 4 가지 조건 혹은 절차를 만족시 켜 야만 한다. 첫째 는 存在聯關 anva y a 이 다. 존 재 연관이 란 A( 예 : 연기)가 있으면 반드시 B (예 : 불)가 있다는 동 반관계를 확인 경험함으로써 세워지는 관계이다• 둘째는 不存聯關
v y a ti reka 이다. 즉 B 가 없으면 반드시 A 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는 경 험 에 의 한 관계 이 다. 세 째 는 無反例 v y abh i cara g raha 이 다• 죽 A 는 있는데 B 가 없는 反證의 경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 귀납추리의 네째 절차는 周延關係의 無 條 件性 u p adh i n i rasa 을확 인하는 것이다. 예물 들어, 불과 연기와의 관계를 多角的인 상황하 에서 여러 번 관찰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데 어떤 조건이 있지 않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4 가지 절차물 다 걸쳐서 얻은 귀납적 결론 아라 할지라도 의심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正 理 哲 學 은 認定한다. 챠르바카 Carvaka 와 같은 회 의 주의 는 바로 이 점 을 의 심 하는 것이다. 죽 과거의 경험적 관찰에 따르면 A 와 B 사이에 주 연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나 미래에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正理哲 學 은 두 가지 방법에 의 하여 귀 납추리 와 周延關係 vy a pti의 타당성 , 따라서 推論 anumana 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한다. 첫째는 假說的 論破 t arka 의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주연관계를 否認할 때 생기는 결론의 不合理性을 지적하여 주연관계를 間接的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연기가 있으면 언제나 불이 있다〉는 주연관계를 부인한다 면 불이 없어도 연기가 있을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오게 되며 이것은 原因이 없어도 結果가 있을 수 있다는 不合理性에 빠지게 되므로 연 기와 불사이의 주연관계는 認定되 야만 한다는 論法이 다. 주연관계~ 뒷받침하는 다른하나의 이론은 正理學派에서 얘기하는 特殊한 知覺 중의 하나인 普通相의 知覺 saman y alak~a l) a- p ra ty ak~a 에 근거 하고 있 다. 이 理論에 의할것 같으면 귀납적 결론은 단순히 個別的 事 例둘 울 관찰하여 이 를 一般化한 것 이 아니 라, 한 事 物의 普返相 saman- y alak~a l) a 의 지 각을 동하여 그 事 物이 屬한 類 全 體 의 지 각이 주어 진 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기와 불과의 주연관계는 여러 개의 구체적인 경우들을 보고서도 알지만 煙 氣 性 이라는 普通相을 지각함으로도 모든 연기와 불과의 관계가 지각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의 本質운 지각하므로 연기가 언제 나 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特殊知梵 야
의하여 귀납적 결론은 보증된다고 한다. 따라서 귀납적 결론이란 단지 몇몇이 그러하니까 모두가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비약이 아니 라, 個別的 事物 에 內在하고 있는 普迫相 의 지 각을 媒介로 하여 具 體的인 예로부터 一般的인 結論을 얻는 추리인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正理哲學의 推論에 관한 理論울 고찰했다. 끝으 로 推論의 三種類를 언급한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正理學派의 五 段階推論은 歸納 과 演釋 을 둘다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正理哲 學 은 推論울 歸納法과 演擇法 으로 나누지 않고 대 신 주연관계 vy a pti의 性格에 따라서 三 種類 로 나눈다. 첫째는 보이는 원인으로부터 보이 지 않는 결 과를 추리 하는 原因的 piirv avat 推理이 고, 둘째 는 브이 는 결과로부터 보이 지 않는 원인을 추리 하는 結果的 §答 ava t 推理이 며 , 세째는 普通關係 가 因果的 연관성을 지니지 않을 때의 推理이다. 예를 들어 뿔이 달린 동물을 보고 갈라진 발궁을 추리하는 것과 같 이 단지 여러 경우를 관찰한 결과로 얻어지는 一般的 類似性에 입 각한 類推的 analog ica l 推理를 말한다. 5 比載와 證言 采當한 지 식 의 세 번째 방법 으로 正理哲學은 떤兪量 up a mana, com p ar i son 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비유량이란 한 이품과 그이름을 가진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지식의 방법으로서, 근본적으 로 比載나 類推에 의거하고 있다. 과거에 본 일이 없지만 이름만 알고 있는 한 사물을 그 사물에 대한 묘사에 의거하여 알게 되는 것을 비유량이라고 한다. 佛敎철학은 이 비유량을 지각과 중언에 환원시키고, 數論과 勝論哲學은 추론에 환원시킴으로써 하나의 독 립된 안식의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 막으로 正理철 학은 聖敎姬, 혹은 證言 sabda, t es tim on y-울 인 식 의 방법 으로 들고 있 다. 〈 Sabda 〉란 소리 라는 뜻이 며 正理철 학의 인 식론에서는 주로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나 중거의 의미를 이해함으 로써 생기는 지식을 의미한다· 證言온 그 내용 혹은 대상에 따라서 可視的 對象 dr 춘t ar t ha 과 不可視的 對象 adr~ t ar t ha 에 대 한 증언으~
구분하기 도 하고, 혹은 누구의 증언 아 냐에 따라서 聖典的 va i d i ka 안 것, 죽 완전무결한 神의 말씀으로서의 베다와, 오류의 가능성이 있 는 인 간에 의 한 세 속적 lauk i ka 인 것 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 勝 論 철 학은 이 증언 역시 하나의 독립된 인식의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 추론의 한 형식으로 간주한다. 증언아란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 함 에서 ’ 오는 지식을 말하브로, 正理철학은 자언히 意 味論에 상당한 관심을 · 보였다. 죽 말과 의미와의 관계, 문장의 성격 등에 관한 이몬을 발 전시켰던 것이다· 正理철학에 의하면 문장이 란 낱말들 p ada 이 모여 어떤 일정한 양식으로 배열됨에서 성립한다고 하며, 낱말이란 글자 들이 어떤 固定된 순서로 배열된 것이라 한다. 낱말의 본질은 i 의미, 죽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에 있으며 말과 대상과의 관계는 항 시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말은 반드시 일정한 대상을 의미하게끔 되어 있다고 한다. 正理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들이 각각 -1 고유의 대상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힘 sakti , po te n q r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힘은 세계의 질서의 궁극적 원인이며 최고의 존재인 神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러한 주장들을 통하여 正理철학은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 단순한 사 · 회관습론적인 설명을 배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言語의 의미가 그것이 指稱하는 대상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 이 란 個物울 지칭하는가, 아니면 普過的 屬性 ja.ti 자체를 가리키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正理哲學은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하여 말 이란 個物둘을 지칭하되 그 個物들이 보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同一한 개념으로서 여러 개의 個物들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한다 .6)
6) 이 미 묘한 문계 에 관하여 B. K. Ma ti lal 의 Ep iste m olog y, Log ic, and Grammar~ (The Hag u e: Mouto n , 1971), pp. 62~77 창조.
正理哲學에 의 하면 文章이 란 낱말들이 어 떤 意 味를 갖도록 組合 된 것이다. 문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낱말들을 組合함에 있어서 4 가지 條件을 充足시켜야 된다고 한다. 첫째 조건은 낱말들이 서로 서 로를 含畜하거 나 필요로 하는 期待性 akank~ 료을 지 녀 야 한다· 예
를 들면, 〈가져 오다〉라는 動詞는 目的語로서 〈무엇을〉이 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둘째는 整合性 y o gy a t a 이 다. 정합성이 란 한 문 장 안에 있는 낱말들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예 를 들어, 〈불로 적시어라〉라는 말은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세 째 는 隣接性 samn i dh i이 다. 죽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낱말들은 時間的으로 혹은 空間的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인접해 있어야만 의미 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말로 하는 문장은 낱말들이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어야의미를가질수있고 글로 씌어전문장에서는공간 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로, 同一한 낱말이라 할 지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니므로 문장이 理解되려면 말한 사람의 舞旨 t a tpar y a 가 알려 져 야만 한다는 것 이 다. 인간들에 의 한 보통의 문장인 경 우에 는 그 論題 p rakara 1_1 a 로 보아서 의 도를 알 수 있으며 , 베 다의 경 우는 미 망사 Mi m amsa 학파에 서 規定하는 解釋 의 規則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以上과 같은 意 味論을 동하여 正理哲學은 證言 sabda 에 의 한 지 식 의 타당성 을 뒷 받 침하고 있는 것이다. 증언에 의한 지식이란 중언의 의미를 이해함 으로써 얻어지는 지석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네 가지 타당한 지식의 방법들에 의하여 正理哲學은 세계 나 인간이나 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한다. 물리적 세계의 구조에 관해서는 正理철학은 勝論철학과 大同小異한 견해를 따르므 로 인간과 신에 대한 正理철학의 형이상학적 견해를 참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6 自我, 神, 解脫 正理哲學에 서 말하는 人間의 自 我 a t man 는 個人我 ji va tm an 로서 인식, 의식, 감정, 마음의 상태 등과 같은 정신적 현상들이 속하는 바 영원한 실체이며, 몸이나 意根 manas 이나 감각기관들과는 다르 다. 자아는 불교철학에서처럼 항시 생멸하는 정신적 현상들의 연 속적 흐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기억이 라는 것이 볼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不二論的 베단타哲學에
서 얘 기 하는 것 처 럼 자아는 스스로 빛 을 발하는 svay a rhp ra kasaka 순수의식 cit도 아니라고 한다. 正理철학은 어떤 주체에도 속하 지 않고, 어떤 대상에도 관계하지 않는 순수의식의 존재를 부인 한다. 자아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정신현상을 속성으 로 가지고 있는 실체이다. 자아는 모든 인식의 주체, 행위의 주체, 經驗의 享受者 bhok t r 이며 윤회의 세계에서 업보를 받게 되는 존재 인 것이다· 그러나 自我 그 자제는 아무런 認識活動도 하지 않~ 다· 오직 意根 manas 과 관계륭 맺고 있는 한에서 인식이 가능한 것 이다· 自我의 存在는 他人의 證言에 의하여 알든지 혹은 간접적인 推論 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한다. 죽 欲望,思避, 認識등과 같은 정 신적 현상들은 모두 記憶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억이란 몸이나 意根 이나 외적 감각기관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영혼의 存在 를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正理哲學者둘은 또한 自我가 內 的 감각기관인 意根에 의하여 직접 지각될 수 있다고 한다. 즉, 意 根은 自我룰 대상으로 하여 순수한 自我意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어떤 正理學者들은 이러한 自我 그 自體의 직접적인 지각가능성을 부인하고 自我는 항시 어떤 정신적 상태의 지각과 더 불어 그러한 상태를 가진 主體로서만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안다〉, 〈나는 행 복하다〉 등의 지 각적 판단에 서 〈나〉에 해 당하는 存 在로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한편 他人의 自我는 그의 知性的 혹은 의도적인 육제적 행위로부터 推理하여 알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 면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는 非知性的인 육체에 의하여서는 행하여 질 수 없고 意識的인 自我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正理哲學에 있어서 해탈의 개념은 이상과 같은 自我의 理解에 直 結된다. 正理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모든 고동으로부터의 해방 apavarga 을 의미하며, 이것은 自我가 아닌 것들, 죽 몸과 감각기관 들과의 관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한다. 몸과 감 각기관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自我의 상태는 正理철학에 의하면 고통분만 아니라 어떤 줄거움이나 행복도 느끼지 않는 상태이다. 아무런 감정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自我는 그 自體핵 :.
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의 正理철학 사상가들 은 해탈을 단지 고동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성추1 로 이해했다. 아마도 베단타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댜 해탈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自我가 몸이나 감각기관이 나 意根과는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는 우선 자아에 대한 聖典, 죽 베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 며 srava1_1 a ,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며 manana, 요가 원리 에 따라 명상해야 한다 nid i d h y a sana. 그리고 자아에 대한 그릇된 지 식 m it h y a- jii ana 이 사라지 면 자아는 욕망과 충동의 지 배를 받지 않게 되 고 행 위 karma 에 의 하여 영 향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 윤회 의 세계에 다시 태어남이 없다는 것이다. 正理철학은 인간의 영원한 自我외에 세계의 창조와 유지와 파괴 의 主가 되는 神의 존재를 인정한다 .7) 神은 세계를 無에서 창조하 거나 自己自身으로부터 放出하는 存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 는 영원한 原子들과, 空, 時間, 空間, 意根들을도덕적인 원리에 따 라서 질서있고 의미있는 세계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者이다. 죽 神 은 세 계 의 質料因 u p죠 dana-kara i:.i a 이 아니 라 能動因 nimitt a-k 쵸 a i:.ia인 것이다. 그는 또한 세계를 도덕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파괴하기 도 하는 者이 다. 神은 영 원하고 무한하며 全知全能한 存在이 다. 그 는 영원한 意識을 갖고 있으나 의식은 그의 본질이 아니라 속성이 라고 본다· 베단타철학의 見解와 根本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다• 神 은 세계의 能動因으로서 또한 모든 生命體들의 행위를 調整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도 완전히 自由로울 수 없으며 神의 引導下에 행 하여 지 는 것 이 다. 人間은 자기 행 위 의 능동적 手段因 ins tr u menta l cause 이 나 神은 인간행위의 능동적 指導因 p ra y o j aka-kar t r 이 다.
7) 正理·勝論哲學의 初期思想에서는 神의 개념이 확고한 위치룬 차지하지 않고 있 으나 後期에 와서는 分明히 有神論的 경향을 띤다.
正理哲學者들은 이러한 神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논중들은 神의 존재에 대한 전형적 인 증명들이 다. 죽 세계는 結果 kar y a 로서 원인이 되는 創造者가 있 다. 諸現象간에 발견되는 질서와목적과 조화등은 知性的인 能動因
으로서의 神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원자들은 근 본 적으로 盲 目的이 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나, 神이 원자들에게 운동을 제공하며 조 정한다· 또한 최초로 말들이 각각 그 대상을 의미하도 록 하는 用法 을 가르쳐 준 者는 神이다• 신은 誤 誘 가 없는 완전무결한 베다의 지식의 원인이 되는 著者로서 베다는 神의 존재를 중거하고 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不可見力이라고 불리는 道德 的 功過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不可見力 자체는 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최고 의 지성을 가진 神의 인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한 행위는 그것에 合當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等의 論證 둘이다· *잠고문현 Bhatt ac hary a , G., St u die s in Ny iiya -Vais e $ik a Theis m . Bulcke, C. The Theis in of Ny iiya -Vais e sik a . • Calcutt a, 1947. Chatt er je e , S. C., Ny iiya Theory of Knowled g e . 2nd ed. Calcutt a, 1950. Chemp a rath y , G., An India n Rati ou a! Theolog y: Intr o ducti on t~ Uday a na's Ny iiya kusumi inj a !i . Vi en na, 1972. Cowell, E. B., tra ns., Udaya na's Kusumi inj a !i, wi tlz the Commenta ry of Hari Dasa Blzatt ac arya . Calcutt a, 1864. Ing a lls, D. H. H. , Mate r ia l s fo r the St u dy of Navy a -Ny iiya . Harvard Orie n ta l Serie s , Vol. 40. Cambrid g e , 1951 . Jac obi, H. , lndis c he Log ik, Nachric h te n der Gott ing e r Gesel! sc haft der Wi ss enschaft en. Gott ing e n, 1901 . ]ha , G., tra ns., The Ny iiya -Sutr a s of Gauta m a wi th Vii tsy i iya na's Bhii$ ya and Uddy o ta kara's Vii rt t ika . India n Thoug h t Serie s 7, 9, 12. Poona, 1939. , tra ns., The Tarkablzii$ ii (by Kesavami sr a) , or Exp o sit ion of Reasonin g . Poona, 1924. Keit h, A. B., India n Log ic a nd At om i sin. Ox for d, 1921 . Mati lal, B. K., Ny iiya -Vais e $f ka . W ies baden, 1977. Mati lal, B. K ., Ep iste m olog y, Log ic, and Grammar in India n · Phil o -
soPhic a l Analys is . The Hag ue , Paris , 1971 . Pott er , K. H., ed., India n Meta p h y s ic s and Ep iste m olog y. Prin c eto n ,1977. Randle, H. N., India n Log ic i n the Early Schools. Ox for d, 1930. Ruben, W. , Zur lndis c hen Erkenntn i s Theorie : Di e Lehre von der Wahr11ehm1mg nach den Ny ay a s iU ras. Leip z ig , 1926. , tra ns., Di e Ny ay a -Su tra s. Leip z ig , 1928. Sastr i , S. K., A Prim er of India n Log ic accordin g to Annambhatt a's Tarkasamg r aha. Madras, 1932. Sp itze r, M. , Beg r if fsu1 1t er suchu11g e n zum Ny a ya -bhii. $ya . Ki el , 1926. Vi dh y a bhusana, 'S. C., A Hi st o ry of India n Log ic. Calcutt a, 1921. , tra ns. , The Ny a ya SiU ras of Got am a. Allahabad, 1930.
제 10 장 大乘佛敎의 展開 1 大乘佛敎의 興起 대승불교 Maha y ana 의 底史的 기원에 대하여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승불교가 發生한 시대와 지역, 대승불교. 와 소승 Hi na y a na 부파불교와의 관계 , 대 승불교의 敎團的 性格 等 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학자들의 연구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 력 기 원 2 세 기 후반에 쿠샤나 Ku g ana 國으로부터 後漢에 온 文婁 迪識온 대승경 전 中에 서 『般舟三昧經』 『首梧嚴經』 『道行般若經』 『寶 積經』 等을 번역했다. 이로 보아 우리는 그때에 대승불교가 쿠샤나 國에 盛行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經典들이 形成되기까지의 時間울 생각하면 대승불교의 發生은 적어도 서력기 윈 1 세기까지는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般若經典 中에서 가장 오 래 된 것 으로 믿 어 지 는 道行般若經 (小品般若) A~ta s ahasrik a-pr aji iap a - ra mi沮- s iit ra 에 는 〈 摩詞衍 Maha y ana 〉이 라뉵 말이 쓰여 지 고 있으며 , 阿閃佛 Ak~obhy a Euddba 에 대한 信仰도 나타나 있다· 또한 支婁進 識이 번 역 한 Ii'般舟三昧經』에 는 阿彌陀佛 Ami tab ha Buddha 의 淨土信 仰도 發見된다. 이런 事實 둘로부터 미루어 보아 우리는 佛 •菩薩에 대 한 신앙과 般若 pr aji ia 思想울 기 반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적 어 ~ 서력기원 전후에 이미 確立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大乘 Maha y ana 〉이 란 말은 〈큰 수레〉라는 말로서 대승불교의 가 르침은 모든 衆生을 彼岸의 世界로 날라다 주는 큰 수레와 같다는 뜻이다• 반면에 대승불교의 운동을 전개한 者둘은 從來의 佛敎를 〈小乘〉, 죽 〈작은 수레〉라 불러 그것이 出家僧만을 위주로 한 편협 한 불교임을 비난했다. 대승불교자들은 王이냐 富蒙들의 지원 아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출가승들의 安逸한 삶과, 신도들 의 물질적 供 養 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정신적 平安만을 구 하는 그들의 소극적이고 現世逃避的인 경향에 반발하여, 一切衆生 을 濟度할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大衆的 佛敎를 提昌한 것이다. 본래 석가모니佛陀 自身은 成佛 후에도 印度의 각 지방에 遊行하면 서 衆生의 濟度에 힘썼으며 원시불교의 출가승들도 그를 본받아 사 방으로 돌아다니며 敎化活動울 폈다. 바로이러한 활동이 불교의 전 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僧伽 sam g ha 의 生活이 점차 組織化되고 안정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충에 따라 출가승들은 在家 信徒둘의 삶과 종교적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寺院에 安住하며 膜想과 埋藥의 寂靜만을 추구하는 高踏的인 생활 을 영 위 하는 한편 在家信徒들은 그들에 게 物質的 布施 dana 를 하 고 世俗的인 功德 p u l).y a 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이 다. 더 우기 寺院의 安定된 생 활을 기 반으로 하여 발달된 敎學的 abhid harma 佛敎는 한가롭게 번거로운 이론적 논의을 일삼게 됨에 在家者둘의 종교적 필요와 욕구로부터 점점 더 유리되게 된 것이다. 大乘佛敎運動은 이러한 교단적 상황에 대한 在家者들의 宗敎的 登躍에서 일어난 것이다. 대승불교자들은 自身의 이익분만 아니라 生死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衆生둘을 이익되게 하는 利他行을 강조하는 行動主義的인 불교를 提唱하고 나왔다. 이러한 大乘의 理想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菩薩의 개념이다. 菩薩은 菩提薩~ bodh i sa tt va 의 略語이 며 菩提薩埋라는 말은 梵語 로서 菩提 bodhi, 죽 깨 달음을 추구하는 有情 satt va , 혹은 〈깨 달음 을 본질로 하는 者〉라는 뜻이다·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指向하는 새 로운 이 상적 인 人間像으로서 大乘은 小乘의 이 상인 阿羅漢 arhat 을 自己의 이익만울 돌보는 利己的인 存在로 배척한다· 보살은 자
신의 구원에 앞서 남부터 구원한다는 慈悲 karun 료의 願 p ra z:ii dhana 을 세워서 淮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生死 의 세계에 태어 나기 룹 원한다. 菩薩道 는 在家者나 出家者를 막론하고 菩提 心 을 發 하고 bodhic ittot p a da 慈悲 의 願윤 세운 자는 누구든지 다 실천할 수 있는 길이었다· 소승불교에서는 最高 의 아라한果 를 얻으려면 在家生活을 버리고 出家者로서 修道룰 해야만 했다. 그러나 보살은 원래 대승 경 전들에 자주 나오는 〈善男子〉와 〈善女子〉들과 같은 在家者들이 었 다. 물론 나중에는 出家한 보살도 생겼으나 出 家 보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250 의 具足戒 p ra ti mok~a 를 받아 僧伽의 一 員 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活動무대는 在家 信徒돌 이 많이 찾아오는 佛陀의 造骨이 나 造品을 奉安한 佛塔이 었다· 그들은 戒 s il a 는 지 켰 으나 僧團生活을 지배하는 律 v i na y a 은 없었던 것같이 보인다.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이란 무엇보다도 석가모니佛의 成佛 이전의 存在를 의미했으며 그의 前生의 行 蹟 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産 出되게 되었다· 소승경전의 本生經 J a t aka 은 바로 이러한 석가보살 의 前生에서의 수많은 利他的인 행위와 업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 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이란 어디까지나 석가 모니佛과 같이 特別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였고 佛이든 보살 이든 다 凡夫衆生들로서는 도처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에 불 과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승불교자들은 바로 이러한 보살의 이상을 普週化하여 누구든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아닌 석가모니 {9ll 이 이룩했던 것과 같은 成佛 그 자체였던 것이다. 아마도 식가모니佛의 前生障이나 傳記 등에서 우리는 대승의 在家者들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이상이 이미 반영된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大乘의 보살둘이 닦아야 하는 修行의 方法도 자연히 소승과는 달 리 八正道 대 신 六波羅密多 pa rami ta, 죽 6 개 의 〈完成〉 혹은 〈到彼 岸〉을 닦는다. l) 죽 布施 dana, 持戒 sila, 忍辱 k 혼 an ti, 精進 vir ya,
1) 〈 Param ita〉란 單語 는 〈p arama( 最上, 完全의 뜻)〉 이라는 형용사의 女性形 p aram i+효로 해석되기도 하며 혹은 p 5ram( 彼 岸 의 뜻)+i(간다는 뜻)+t a 로서 이 해되기도 한다. 深譯 전몽적으로는 후자윤 使用해 왔다. 〈倒彼岸〉, 〈度〉, 아니면 音 譯 으로 〈波羅密〉이라고 번역되었다.
禪定 dhy a na, 智慧 p ra j na 이다. 과라밀다의 개념은 소승의 문헌들에 이 미 발견된다. 有部 의 『大昆婆沙論』은 四波羅密多說을 언급하고 있 으며 本生經에는 十波 羅密多몰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六波羅密多 룰 選定하여 확고한 修行의 원리로 세운 것은 대승불교자들에 의해 서였다. 六波羅密多 중에서 독별히 주목할 것은 布施 dana 의 개념 이다. 布施란 소승불교에서는 주로 在家者둘이 出家僧들에게 행하 는 물질적인 供羲을 의미했으나 대승불교는 그것을 보살들 자신이 실천해야 할 첫번째의 항목으로 삼은 것이다. 다음에 留意할 것은 般若波羅密多 로서 대 승에 서 般若 p ra jii a 란 주로 諸法의 〈空〉, 즉 無實體性의 眞理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의 바탕에 근거하여서만 남은 다섯 파라밀다도 올바르게 닦아질 수 있다고 한 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일찍부터 般若파라밀다를 주제로 한 많은 經둘을 산출한 것이다. 대승불교의 또 하나의 특칭은 菩薩에 대한 신앙이다. 대승불교에 의하면 보살은 수없이 많이 있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十方世界 의 곳곳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위 하여 淮築울 求하지 않고 生死'의 세계에서 고동을 당하는 衆生들을 도우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小乘佛敎에서는 해탈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他力 의 信 {[0 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보살의 우한 한 자비심을 믿기 때문에 엄격한 영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신앙 적 불교로 나아가게 된 것 이 다. 觀世音보살 Avalokit es vara, 大勢至 보살 Mahas t h 료 ma p ra pt a, 文殊보살 Manju s r1, 普賢보살 Samanta b hadra 等은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대표적인 보살들이다. 대승불교는 佛陀觀에 있어서도 큰 愛 化룰 초래했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一般化되었듯이 佛陀의 개념도 일반화되어 三世十方에 수 없이 많은 佛陀가 存在한다고 믿는다· 소승불교에서는 佛陀라 하면 무엇보다도 歷史的인 석가모니佛을 意味했다 . 물론 소승불교에서도 過去 七佛 혹은 二十五佛, 또 未來佛인 彌勒佛 Mait re y a Buddha 의 觀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승에서처럼 佛의 개념이 일반화되지 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승에서는 과거의 佛돌은 모두 埋 菜 에 둘
어가서 生死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존재들로 이해되 는 반면에, 대승에서는 諸佛은 宇宙의 各方에서 보살들과 함께 淨 土를 이루며 거기서 살아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로 간주된다. 대승 불교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佛陀觀의 변화를 밑받침하기 위하여 佛 陀의 三身說 t r i ka ya 울 전개 했 다. 죽 佛陀에 는 3 가지 몸이 존재 한 다는 것 이 다. 첫 째 는 化身 혹은 應身 n i rma i;i aka y a 으로서 衆生의 敎 化를 위해 地上에 태어난 歷史的인 佛陀를 의미한다. 둘째는 報身 sa ril bho g aka y a 으로서 보살이 願을 發한 후 오랜 修行울 하여 그 결 과로서 얻 은 超 自 然的 인 몸을 말한다. 阿彌陀佛 Ami tab ha Buddha 은 그 가장 좋은 例이 다. 세 째 는 法身 dharmaka y a 으로서 어 떤 보이 는 形態도 초월하며 모든 佛의 근거가 되는 眞 如의 깨달음 그 自體를 뜻한다. 諸佛과 菩薩들에 대한 信{f 0 과 더불어 자연히 信徒들 가운데는 그 들을 形象化하여 崇拜하려는 熱望도 생기게 되어 많은 佛像과 菩薩 像들이 제작되게 되었다. 特別히 中央印度의 마두라 Ma t hura 라는 곳과 西北印度의 간다라 Gandhara 地方온 이 러 한 佛像製作의 中心地 였다. 간다라地方의 佛像온 佛의 形相융 희랍의 神像들에서 발견되 는 優雅함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 알렉산더大王 이후로부터 그 지 방에 盛行했던 희랍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승불교는 在家者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여 佛 • 菩薩의 崇拜 이 외 에 도 佛陀의 造骨이 나 造品을 奉安한 1911~ s tilp a 의 參拜는 물론 이요, 심지어는 大乘經卷의 崇拜도 행했다. 죽보통의 在家者둘로서 는 도처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를 담은 經卷을 塔 안에 安 置하고 崇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經卷의 受持,讀踊, 書寫 의 행 위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功德 pU J).y a 을 지닌 것으로 권장되었 다. 사실 이것은 國王이나 富奈들만이 할 수 있는 寺塔의 建立이나 莊園의 寄進과 같은 것에 비하면 비교적 큰 經濟力이 없는 者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로서, 大乘佛敎가 일어날 당시에 確固한 社 會的, 經濟的 기반을 갖고 있던 小乘敎團에 대한 大乘의 大衆的인 社會的 地位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승불교는 또한 이상과 같은 各種의 신양적 행위를 통하여 얻어
지는 功德을 한 個人이 자기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衆生의 濟度를 위하여 넘겨 준다는 소위 廻向 p ar ii:i amana 의 質 行도 강조했다. 이것은 물론 業의 法則에 대한 엄격한 個人主義的 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慈悲의 정신 의 표현인 것이다. 실로 이상과 같은 大乘의 宗敎的 運動은 從來의 佛敎에 비하면 훨싼 더 종교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하며, 한 마디로 표현하면 大乘의 宗敎世界는 小乘佛敎처럼 외롭지 않은 世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前期의 大乘經典들 대승불교의 지도자들은 자연히 그들의 종교적 이상을 담은 경전 돌을 産出하게 되었다. 대승경전들도 형식상으로는 〈佛說 Buddha- vacana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석가모니불의 說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승불교자들은 그들의 경전이 본래 언어를 초월한 불타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 문에 이런 뜻에서 〈佛說〉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주 장에 의하면 불타의 참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진리뿐이 나 ekaya na (一乘) 듣는 사람들 각각의 처 지 와 능력 에 따라 다르게 說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乘經典들은 上根機의 사람들을 위한 說法으로 간 주되고 있는 것이다. 대승경전의 形成은 대체로 前後二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期 는 서력기원 1 세기부터 대승의 최초의 論師인 龍樹 Na g ar j una 의 때 까지이다. 龍樹의 年代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2 세기 후반에 서 3 세기 초 (150~250A . D.) 의 人物로 推定된다. 그를 前期大乘經典 둘의 終點으로 삼는 이 유는 『大智度論』을 비 롯하여 그의 著作들이 다수의 대승경전들을 引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龍樹가 당시의 모든 대승경전들을 다 引用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에 의하여 인 용된 것은 확실히 前期經典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계 前 期의 대승경전들 가운데서 主要한 것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 다.
1 『大熙표森經 Sukh 죠 va t.i: v yii ha -s iit ra 』 阿i];f;f rt . ~ll Ami tab ha (Arnit ay u s) Buddha 에 대 한 신 앙은 대 승의 불 • 보살신앙 및 淨土往生 신앙의 가장 代表的인 표현으로서 많은 대승불 교 신 자들의 歸依處가 되어 왔 다. 〈 1 記函益〉 라는 말은 〈 Am it a y us 〉를 번 역 한 말로 〈 무한한 壽 命〉이 란 뜻이 고, 『大 無표 海 經 』 2 ) 의 梵名
2) 『大無묘 潟 經』 은 『阿彌陀經』과 『觀無f,'沮i.법 經』 과 더 불 어 淨 土 宗의 所依經典으로서 淨士三部經 이 라 불린 다. 3) 『大正新修大藏經』 Vol. 12, p. 268a. 梵本과 내 용상 差異 가 있 다. Max Mi llier , tra ns., The Large r Sukhavati -v y iiha , Buddhis t Mahaya na Texts , The Sacred Books of tire East , Vol. XLIX, p. 15 參照
2 般若波羅密多 Prajf iiipiira mi ta 계통의 경전들 般若계통의 經에는 碩 (32 음절의)의 數에 따라 길고 짧은 여러 개 의 經둘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성립됐다고 간주되는 것은 『八千碩般若 A~ t as 줍 bas ri ka .!J (小品般若) 이 며 이 것 이 摘大되 어 25, 000 碩 의 『大品般若』가 成立되 었으며 龍樹의 『大智度 論』 은 바로 이 『大品 般若』의 社釋書이 다. 그 외 에 도 18, 000 碩, 100, 000 碩으로 된 것 도 있 었으며 짧은 것 으로는 『金剛般若波 羅密多經 Vajr a cched ika -pr aji ia- p aram it a-s iit ra 』의 500 碩 , 『般若心 經 Pra jii a p aram it a-hrda y a-s iit ra 』의 300~ 과 같은 것이 있다.
般 若經 典의 주요 사상은 空思想으로서 諸法은 自性 svabhava 이 없 이 空하며 이것이 諸法의 宜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승불교, 목 히 說一切有部에서 法을 質體視하는 경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으로서 대승불교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諸法이 空함을 깨닫 는 것이 般 若 , 죽 智慧 p ra ji'i a 이며, 이러한 지혜에 입각하여 보살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댜 空親에 의거한 보살의 修行울 『金剛經』 은 〈 應 無所住而生其心〉이 라 表 現하고 있다. 諸法이 空하고 모든 현 상적 차별들이 虛妄한 것임을 께달으면, 佛陀와 衆生, 濟度하는 者 와 濟度 받는 者, 世間과 出世間, 淮築과 生死의 差別이 모두 사라 져버리고, 佛陀의 說法도 說法이 아니라는 것을 般若經典둘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3 『維摩誌所說經 V i malak i r ti n ir desa-s iit rn』 위 와 같은 空思想에 입 각하여 때£摩經』은 世俗社會의 적 극적 인 참 여 와 在 家 佛敎의 이 상을 가르친 다. 이 經의 주인공은 維摩話 Vi ma la_ k i r ti이 라는 居士로서 그는 智 慧 에 있어서 佛陀의 다른 出家한 계자 들보다도 훨씬 뛰어나 그들을 무색하게 하고, 어디서나 自由自在 하는 거침 없는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實在는 모든 對立을 초월한 不二 adva y a t va 의 絶對平等한 경 지 로서 不可思議하고 言語로 表現 할 수 없다는 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經의 構成도 드라마틱한 면이 있는 興味로운 經典이 다. 4 『正法蓮華經 Saddharmap u ndarik a -sii tra (法華經) 』 『維摩經』이 아직도 大乘의 理想을 小乘에 대립시켜 논하고 있는 반면에, 『法華經』은 이러한 對立的 견해를 초월하여 센鼎 E 의 여러 敎 說둘은 결국 모두 衆生의 敎化를 위 한 方便 u p a y a 에 지 나지 않고, 聲 聞 Sravaka, 緣섯~ Praty e kabuddha, 菩薩 Bodh i sa tt va 의 三乘은 결국 一乘 ekay a na 혹은 一센隅론에 귀 결 한다는 대 승불교의 포용적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一佛乘에 의하여 모든 衆生은 成센t하는 것이다. 佛陀觀에 있 어 서 도 『法華經』은 付鼎 E 가 出生하여 1:1:頃근하고 成佛한 후 入滅한 것은 단지 衆生의 敎化를 위한 方便에 지나지 않고 質은 佛
陀의 壽量 은 不可 數.fil 이 고 그의 成道 는 無賊却 의 前에 이 룬 것 이 라 고 한다· 『 法華經 』은 이상과 같은 진리들을 여 러가지 비유로 설명 하고 있으며 文學的 價 (直가 높은 經 典이 다. 佛塔 信 仰과 經卷信 仰도 이 經 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5 華嚴系統의 經典 『華嚴 經 』에는 漢譯 으로 40 卷本 , 60 卷本 , 80 卷本 의 三種이 있으냐 중국에 서 는 5 세 가 에 佛昧跋陀羅 Buddhabhadra 에 의 하여 번 역 된 60 卷本의 『大方廣佛 華嚴經 Mahava ip ul y a-buddha-ava t amsaka-s ilt ra 』이 가 장 널리 使用되어 왔다. 『華 嚴經 』은 매우 방대한 문헌으로서 본래 는 독립적으로 流通되던 여러 經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iL. 있 다· 『華嚴 經 』은 주요 내 용으로서 『十地品』에 서 佛의 正 &2 에 도달 하기 위하여 十波 羅密 을 닦아가는 보살의 因行을 十地의 단계로 구 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4) 또한 十地의 前段階로서 十住, 十行, 十廻 向도 論하고 있다. 다음에 『入法界品』에서는 보살의 수행과정을 善 財 Sudhana 童 子의 求道記로서 실감있게 그리고 있다· 〈法界〉란 보 살이 여래가 되기 위하여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 眞理를 말하는 것 으로서 善 財 童 子는 社 會 의 各界各層에서 活動하고 있는 53 善知 識 을 찾아다니 며 說法을 듣고 마지 막으로 彌勒佛을 만나서 法界믈 證 得 한다· 『十地品』에는 〈三界虛妄 但 是 一心作十二因 緣 分 皆依心〉이 라는 유명 한 唯心思想 citt a - ma t ra t a 을 說하는 구절 이 발견된 다. 이 것 은 十二支因緣分 가운데 서 第三支 , 죽 識 vij fian a, citt a 을 가장 重 視하는 것으로서 唯 識 思想의 發達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다.
4) 十波 羅密은 六波 羅密 에 다 方使, 願 , 力, 智의 波羅密울 더 한 것 이 다.
*참고문현 Conze, E., tra ns., The Perfe c ti on of Wi sd om in Ei ght Thousana Lin e s and its Verse Summary. Boli na s, 1973. , Buddhis t Wi sd om Books: The Di am ond Su tra and the Heart Sutr a . London, 1958.
Cowell, E. B., M. Mi llier , & J. Takakusu, tra ns., Buddhis t Mahay a na Texts . SBE, Vol. XLIX. Ox for d, 1894. Dutt , M. N., Asp ec ts of the Mahay a na Buddhis m and its Relati 011 to Hi n aya na. London, 1930. Kern, H. , tra ns. , The Saddharmap u r; ,Ja rik a or the Lotu s of the True Law, SBE, Vol. XXI, Ox for d, 1884. Lamott e, E., tra ns., L'Enseig n ement de Vi m alakir ti . Louvain , 1962. Thurman, R. A. F. , tra ns. , The Holy Teachin g of Vi m alakir ti. Uni- versit y Park and London, 1976. Walleser, M., Praji iap ar ami ta: Die Vollkommenheit der Erkenntn is . Gott ing e n, 1914. 宇井伯菩, 『大乘体敎(/)硏究』 ' Ii'{!.,.敎怪典史』, 『宇井伯菊著作選集』 7. 平川彰, 『初期大乘体敎(/)硏究』 薛谷正雄, 『初期大乘怪典(/)成立過程』 宮本正尊, Ii'大乘 &小乘』 編, 『大乘体敎 0 成立史的硏究』 山田童城, 巧t語{L,.典(/)諸文軟』 , 『大乘体敎成立史序說』 平JJI, 椎山, 高崎編 『大乘体敎타치可/J•.!1, 『講座 • *乘休敎』 1. 中村元編, 『華嚴思想』 望月 信亨, Ii'淨土敎 0 起源及堯達』 坂木幸男編, 『法華怪(/)思想 & 文化』
제 11 장 中觀哲學 1 龍樹와 中觀哲學의 傳統 대승불교는 처음에는 소승불교의 번잡한 교리의 연구를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에 반발하여 대중적인 종교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승불교도 자연히 철학적으로 자신 을 정립하고 옹호할 필요에 봉착했던 것이따· 그리하여 소승불교와 같이 많은 論 sast ra 등을 쓰게 된 것 이 다. 大乘의 論 書 들 중에 서 계일 일찍 씌어진 것은 대승의 最高의 論師로 추앙되어 오는 龍樹 · Na g ar j una 의 것들이다. 龍樹는 서력기원 후 2~3 세기 경의 인물로 추정되며 남인도 출신의 사람으로 불교의 여러 사상뿐만 아니라 外 컨 思想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의 처서둘을 통하여 그는 大乘의 空 떠한게 입각하여 이에 어긋난 여러 實在論적 견해들을 논파하고 있 .r• 용수 당시에는 전에 언급한 초기의 대승경전들, 죽 般若經典, 『華嚴經』, 『法華經』, 淨土經典들이 비록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 겠지만 이미 성립되어 流通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용수의 처서들을 동하여 알 수 있으며, 용수는 이들 諸經典들을 해석하는 論둘을 지은 것이다. 그의 저서들 가운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 般若經典계통의 空思想에 입각하여 그못된 實在論的인 견해들 을 논과하는 저 서 들로서 , 『中論 M iil amadh y amaka-ka ri ka 』, 『十二 FT
論 Dvadasan i k죠y a-sas t ra 』, 『空七十論 Siin y a ta s ap tat i. !l ® 역 시 空思想에 입 각해 外道를 破하는 『廻靜論 Vig r aba-vy a var- t an1 』 ® 『大品般若』의 証釋 書 로서, 龍樹思想의 여러가지 측면을 포괄 적으로 보이는 저서인 『大智度論』 ® 『華嚴經』의 〈十地品〉의 証釋 書 인 『十住昆婆沙論』과 華嚴의 唯 心思想을 論하는 『大乘二十論』 등이 있 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용수의 교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 었으며 단순히 般若經典의 空思想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空思想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의 『中論』울 중심으로 하여 中觀哲學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용수의 제 자로서 提婆 Ar y adeva 라는 사람이 있어 서 『百論 Ca t u q. sa t aka 』을 처 술했다. 이 『百論』은 용수의 『中論』 및 『十二門論』과 함께 中國 三 論宗의 기본 論書룹 이두었다. 서력기원 350 년경에는 靑目 Pin ga la 이 라는 자가 나와서 『中論』의 주석 서 를 썼으며 , 鳩摩羅仕 Kumaraj1 v a 에 의하여 漢譯되어 중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세기부터는 唯識哲學이 인도불교에 풍미함에 따라 中觀哲學은 자연히 唯識哲學 의 학자들에 의 하여 연구되 었 다. 6 세 기 에 는 센關~ Euddha p a lit a 와 淸 辯 Bhavav i veka 이 나와서 『中論』의 주석서플 썼으며, 『中論』 해석상 의 차이를 보여 中觀學派의 두 主流를 형성하게 되었다. 佛護 계몽 으로 月稱 Candrak1r ti이 나와서 『淨明句論 Prasanna p ada 』이 라는 『中 論』의 주석 서 와 中競哲學의 入門書인 『入中論 Madh ya mak 죠 va t ara 』을 써 서 티 벳불교에 유행 하게 되 었 다. 淸辯은 『般若燈論 Pra jii a p rad1 p a 』 이라는 『中論』의 주석서를 썼으며 그는 의식적으로 唯識哲學者인 護 法 Dharma p ala 의 唯識說을 비 판하여 中觀과 唯識 兩派의 대 립 을 격 화시 켰 다. 佛護의 中觀學派를 프라상기 카 Prasan gi ka 학과라 부르며 , 자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견해만을 모순 적인 것으로 논과하는 부정적인 방법을 使用하는 반면에, 淸辯의 中觀學派를 스바탄트리 카 Sva t an t r i ka 라고 부르며 , 자기 의 주장을 적 극적으로 천명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淸辯의 계통으로 7 세기의 智光 Jii ana p rabba 은 諭伽行哲學에 대 항하여 空思想의 우위 성 을 주장
하기 위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三時로 나누는 敎判을 제시했다. 죽 小乘은 四聖諦폴 통하여 心境供有를, 諭伽行派는 萬法唯識說을 몽 하여 境空心有를, 그리고 中親哲學은 諸法皆空의 理致룰 동하여 心 境供空을 진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中論』의 哲學 『中論』에 나타난 龍樹의 사상을 이 해 하기 위 하여 우리 는 『中論』 의 〈中〉의 개념을 먼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소승 경전에서 佛陀 자신이 人間存在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中道的인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죽 그는 인간에게 어떤 불변의 形而上學的 實在가 있다고 인정하는 有의 입장도 거부했으며, 동시 에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無로 돌아간다는 無의 입장도 거부했다. 『中論』의 〈中〉은 이와 같은 불타의 기본적 입장을 더욱 더 확대하 여 세계 전체에 대한 存在論的 규명을 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法온 스스로 존재 하는 自 性 svabhava 아 없기 때 문에 空한 것 이 다. 그러나 空은 결코 無가 아니며, 다만 自性이 없이 條件的으로 生起 하고 있는 현상세계의 實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空이 란 非有 • 非無이 며 中道 madhy a ma p ra tip ad 인 것 이 다. 非 有·非無라는 것은 空이라는 말과 같이 實在를 부정적으로 표현하 는 破邪의 말이요, 中道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顯正의 말인 것 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세계의 참 모습이 非有 • 非無이며, 中道란 말인 가?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中論』의 다음과 같은 유 명 한 구절 이 다 :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 義〉. 因緣에 의해 조건적으로 생기는 모든 法은 自性이 없이 空하다 는 말이 다. 즉 空은 緣起 p ra tity asamu tp ada 의 眞理에 근거 한 것 이 다· 용수는연기설을소승불교, 록히 有部에서처럼 諸法의 존재를일 단 인정하고 나서 그들의 因果關係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緣起說의 참 철학적 의미는 어떤 法도 綠起의 지배 를 받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自性을 결여하고 있는 無自性 nil_ lsv abhava, 따라서 空 s ii n y a t a 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諸法의 質相이 空임을 알면, 그 諸法이 아무 것도 아닌 無인 것이 아니라 空한 그대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 이 름을 가지 고 존재 하는 것 이 다. Ii'般若心經』의 말과 같이 〈色郞是空〉 이 요, 〈空卽是色〉인 것 이 다. 이 것 을 용수는 假名 p ra jii a pti이 라 부른 다. 〈假〉란 말은 〈空卽是色〉, 혹은 〈眞空妙有〉의 현상 세계가 空임 에도 不拘하고 단지 방편상으로 인정된다는 뜻으로서, 假名이란 自 性을 缺如한 空한 法들이 그런대로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妙有를 의미하는 것이다. 죽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닌 中道의 妙有인 것이다. 문계는 모든 것이 假名이라는 진리물 모르고 현상적 차별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誤認하여 有나 無의 見에 . 빠지며 고통 을 받는 것이 보통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이러한 잘못 된 견해를 타파(破邪)하여, 實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고 (顯正) 한 것이다. 破邪 그 자체가 다름아닌 顯正인 것이다. 龍樹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계의 실제의 모습인 바 空을 깨닫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용하고 있는 言語와 槪 念둘의 성격과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한다. 죽우리가사용하는 言語는 事物을 實在論的으로보게 하는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가 이 일상언어를 매개로 하여 세계불 보는 한 사물들이 각각 독립되 고고정된 본질을 갖고實在하는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마치 색안 경을쓴 사람이 바깥세계가모두 그 안경의 색깔을가지고있다고착 우각리하들는이 것 과日 常마的찬으가로지 인사 용것하이고다. 있 는따 라生서 • 용滅 수• 는常 •『 斷中 論• 』一의 •初異頭 • 에*서 · 出 등의 개념을 예로들어 批判的으로分析하며 그들이 순전히 우리 들의 머 릿 속에 서 구성 해 낸 觀念 v i kal pa 들로서 모두 戱論 pra p afica 에 지 나지 않음을 갈파한다. 여기서 龍樹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 법은 一種의 破埃的인 辯證法으로서 諸槪念들의 하나하나를 考察하 여 그것들이 결국모순적이고 相對的이고 不合理한 것임을 드러내는 歸霞法 pra sang a , reducti o a d absurdum 이 다. 이 러 한 개 념 들은 龍樹에 의 하면 모두 우리 가 空의 眞理를 모르고 사물을 實在論的으로 보는 習慣에서 유래하는 헛된 관념들인 것이다. 〈生〉의 개념 하나만을
分析함으로써도 龍樹는 당시의 印度哲學에서 論 議 되고 있는 一切의 形而上學的 因果論을 궁극적으로 不合理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緣起, 즉 空의 世界는 不生, 不滅,不斷, 不常, 不一, 不異, 不來, 不出(八不)이며 모든 言 語와 觀念들이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지이다. 언어는 진리를 否曲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龍樹는 日常的 言語나 觀念의 타당성을 무조건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二諦說에 접하게 된다. 龍枝1 에 의하면 우리는 事物울 볼 때 높고 낮은 두 가지 觀點에서 볼 수 있 다고 한다. 그리 고 이 두 가지 관점 에 따라서 眞諦 pa ramartb a -saty a 와 俗諦 samvr tti -sa ty a 가 成立된다는 것이 다. 眞諦란 事 物을 있는 그 대로 般若 p ra j na( 智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言語를 초월한 空의 眞理를 말하는 것이며, 俗諦란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눈으로보는 세계로서 진리가 가리워진 samvrtt i 모습을 말한다. 龍樹는 이 러한 日常的인 眞理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空 의 立場에서 볼 것 같으면 모든 言語의 使用과 哲學的思惟는 다름 아닌 俗諦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龍樹는 말하기를 俗諦폴 떠나서는 眞諦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鼎t의 敎說들은 주 로 우리의 日常的인 관념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空의 眞理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 구든지 眞諦를 깨닫기 아전까지는 俗諦의 方便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眞諦인 空이라는 것 자체가 妙有와 假名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깨달은 者 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俗諦란 眞諦의 자유로운 活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俗諦와 眞諦의 구별 자체가 하나의 方便上의 구분은 될지언정 어떤 궁극적인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眞諦인 空의 世界는 모든 差別과 對立이 사라져 버 린 不二의 advay a 世界로서 有와無, 生死와追藥, 迷와悟, 衆生과佛陀, 그리고俗諦 와 偵諦의 區別조차 부정 되 며 空마처 도 空인 一切無所得 anup a labdbi 의 世界이 다. 그러 나 空의 世界는 同時에 모든 差別의 相돌이 그대 로 살아 있는 多의 世界이기도 하다. 龍樹는 바로 이 多의 世界에 입 각하여 俗諦를 建立하고 『中論』의 哲學울 전개 하는 것 이 다.
*참고문현 de Jon g , J. W. , tra ns. , Cin q Chap itre s de la Prasannap a dii . Paris , 1949. La Vallee -P oussin , L. de, tra ns., Madhy a makavata r a, Museon 8-12 (19 07ff ) . Lamott e, E., tra ns., Le Trait e de la gr ande ver t u e de sag e sse. 2 vols. Louvain , 1944'. 1949. May , J., tra ns., Prasa11napa dii Madhy a makavrtt i. Paris, 1959. Murti , T. R. V., Centr a l Philo sop h y of Buddhis m . London, 1955. Rapmr aajni iainiP, ii rKa . mVi .t,i i-Ns iii isg t i r ia r.j u Vnae'rsm Ponhti l o& so Tp ho yk ya os , P1r9e6s6e.n te d in the Maha- Robin s on, R., Early Mi idh y a mi ka in India and Chin a. Mad iso n, W isc onsin , 1968. Schaye r, St. , tra ns. , Ausg e wahlt e Kap ital aus der Prasannapa dii . Cracovie , 1931 . Sp r ung , M. , tra ns. , Lucid Exp o sit ion of the Mi dd le Way : The Essen· tial Chap ter s fro m the Prasam1apa da of Candrak irti. Boulder, 1979. , ed. , The Problem of Two Truth s in Buddhis m and Vedanta . Dortr e cht, Holland, 1973. Str e ng , F. , Emp tine ss: A St ud y in Relig iou s Meanin g . Nashv ille , Tennessee, 1967. Stc h erbats k y, Th. , The Concep tion of Buddhis t Ni ruiir ;a. Len ingrad , 1927. Walleser, M., tra ns., Di e Mi ttler e Lehre des Ni iga rju na. Heid e lberg, 1911, 1912. 山 口 益, 『月稱 造 梵文中 論釋 』 I , II • , 『中觀佛敎 論 政』 ' Ii'般若思想史』 , 『空의 世界』 宮本正앓 『根本中&空』 『中道思想&-7c 0 發 達 』 宇井伯 葛 『印度哲 學 硏究』 第一
제 12 장 後期大乘經典둘의 思想 1 歷史的 背景 불교는 바라문교내의 한 分派的인 宗敎운동으로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分派들과는 달리 불교는 왕성한 포교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쇼카와 카니쉬카와 같은 崇佛 君主둘의 지원에 힘입어 印度 전역에 융성하게 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불교는 결코 정통 바라문 종교를 제압하지는 못했다. 불 교는 이마 인도인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베다의 권위나 제사주의적인 종교행사물 거부함으로써 언제나 이단적인 종교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불교는 또한 바라문 계급의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 워 놓은 四姓制度와 生의 段階 var 1_1 a-asrama 를 중심 으로 한 사회 운 리질서, 죽 〈다르마 dharma 〉의 체계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따라서 일 반 在家者들의 생활윤리는 어디까지나 바라문교의 전통에 의하여 지 배 된 것 이 다. 그렇 기 때 문에 아쇼카 Asoka 왕의 마우리 아 Maurya 왕조가 망한 후 숭가 Sun g a 왕조는 불교를 억 압하고 바라문교를 부 흥시켰다. 또한 異民族에 의해 세워진 쿠샤나 Ku~ana 왕조 때에도 불교의 세력은 복부인도를 석권했지만 남쪽에는 순수 인도적인 샤 타바하나 Sata v ahana, (Andhra) 왕조가 일어 나서 바라문교를 국교로 받들고 보호하는 정책을 썼다. 쿠샤나 왕조와 샤타바하냐 왕조는
약 3 세기부터는 세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는 여러 소국가들 이 대립한 가운데 정치적 혼란기로 들어갔다. 그러나 320 년경에 는 찬드라굽타 Candrag u p ta I 세가 굽타 Gu pt a 왕조물 세우고 사무드 라굽타왕 Samudra gupt a(330 년경 즉위) 때에는 전인도를 통일함으로 써 마우리아 Maur y a 왕조 이후 약 500 년만에 비로소 동일국가를 다 시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굽타 왕조는 6 세기에 흉노족의 침입 등으로 망하기까지 안정된 사회질서 밑에 학문 • 예술 등 각 방면 에서 찬란한 文化를 건설했다. 종교적으로는 바라문敎가 國敎로 인정되어 바라문의 倫理秩序가 全印度社會에 定着하게 되었다. ~ 한 굽타王朝 때에는 쉬바神과 비슈누神에 대한 大衆的인 信仰도 널 리 퍼져서 印度全域에 수많은 雄大한 神殿들이 建築되었다. 바라문 들에 의하여 傳授되어 온 산스크리트 Sanskrit 言語와 文化는 全印 度에 보급되었으며 古典산스크리트語가 全國的인 公用語로 사용되 게 되었다. 印度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칼리다사 Ka li dasa 와 같은 詩人도 굽타왕조의 초기 에 활약한 사람이 다. 이 러 한 文化的 환경 속 에서 바라문의 正統哲學派들은 각기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고전 산 스크리트語로서 많은 體系的인 저술들을 산출하게 된 것이다. 실로 이 時期는 印度古典文化의 黃金期라 할 수 있다. 굽타王朝는 바라문敎폴 國敎로 삼기는 하였으나 佛敎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굽타王朝는 宗敎的인 寬容性을 보여 佛敎도 지원해 주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5 세기初에는 불교의 옛 고장인 마가다地域에 有名한 나란다 Nalanda 라는 大寺院이 세워지 고 그 후로부터 수백년 동안 佛敎敎學硏究의 中心地가 된 것이다. 思想面에 있어서도 불교는 자연히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추세에 영 향을 받아 바라문의 敎學에 대응하여 많은 體系的인 哲學的 문헌들 을 古典산스크리트語로 産出하게 되었다. 이들은 내용에 있어서도 正統바라문 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그것에 대하여 변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동시에 바라문의 哲學的 思惟풀 크게 자극시키기도 했다. 이 時期에 나타난 大乘經典들의 중요한 것들을 든다면 우선 淮葉 을 적극적으로 常·樂·我•淨으로규정하며 法身常住룰 說하는『大
般淮 築經 』,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如 來 가 될 가 능성의 근거로서 如 來 藏 이 라는 自 性 淸淨 心이 있 다는 사상을 설 하는 『 勝際經 Srim ala- s iit ra 』아 나 『如來 藏經 』, 唯 識 哲 學 의 근본경 전 으로서 阿 頓 耶 識 緣起 思想과 萬 法唯 識 을 說 하는 『解 深密經 Sarhdh i n i rmocana-su t ra 』 , 如來 藏 思 想 과 阿 頓 耶 識 思 想 과 몰 융화시켜 如 來藏緣起說윤 발전시킨 『勝 伽 經 Lankava t ara-s iit ra 』 동을 들 수 있 다 . 이 들 후 기 대 승경 전 들 은 모두 龍 樹 이 후 世 親 Vasubandhu 에 이 르기 까지 3~5 세 기 초에 걸 쳐 서 形成된 것으로서 주로 如 來藏 tat h a g a ta g a rbha 혹 은 佛性論 的 思想 과 唯 識 思 想 v ijii a pti -ma t ra t료에 기 초하고 있 다. 그 들 은 般若經典 이 나 中 觀 哲學 의 空思想을 받아들이면서도, 實 在에 대 한 부 정 적 접 근 방식 울 지양하여 佛이나 열반을 常住不 滅 의 質 在에 간주하며 인간에 있 어서도 佛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원한 性 品이 있음 을 강조하여 우파 니샤드的인 바라문思 想 에 接 近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 래의 無 我 說 ana t man 을 지키 면서도 輪廻 의 主 體 로서 阿頓 耶 識 alay a - v ij喆 na 이라는 存在 룰 設 定하여 人格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業報를 설명하려고 꾀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을 더욱더 철 학적으로 발 전시키며 理 論 化한 사람들이 諭 伽行派 Yo g acara 의 哲 學者 들로서, 彌勒尊子 Mait re y an ath a , 無 著 Asang a, 世親 Vasubandhu 의 思想은 大 乘敎學의 극치를 이룬다. 우선 그들의 哲 學 울 고찰하기 전에 이 시 기에 형성된 주요 경전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2 唯識思想 系統의 經典 1 『解深密經 Sarndh i n i rrnocana-s iit ra』 이 經은 唯 識 思想系統의 경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解 深密 經』은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經典으로서 經 이라기보다는 論 에 가까운 經典이다. 이 經의 梵語 原本은 남아 있지 않으나 티벳語 譯 本이 있으며 漢 譯本으로서 菩提流支 譯 (514 년)과 玄裝 譯 (647 년)이 남 아 있다. 이 經 의 〈 勝義 諦相品〉은 般若 經 典의 般 若 思想에 입각하여 勝義諦, 죽 眞諦 p aramar t ha-sa tya 의 다섯 가지 면을 說하고 있 다. 勝 義諦는 有爲無爲의 二相이 없으며, 一切의 名 言 을 떠난 相, 尋 思믈
초월하는 相, 諸法과의 一異性을 초월한 相, 一切에 追在하는 一味 相의 四相울 가지 고 있 다고 한다· 또 〈一切法相品〉과 〈無 自 性相品〉 도 空思想에 입 각하여 렵f法의 實相을 三相 t r i lak~a l) a 과 三無 自 性의 이론으로 說明하고 있다. 三相이 란 妄情에 의한 言說 vy avahara 과 假名 pr ajn a p ti 때문에 諸法 의 名稱들을 設定하고 執着하는 過計 所執 相 pa rik a lpi ta- lak~ai;i a, 十二支 緣起 에 서 보여 주는 것 과 같이 話法이 緣에 의 하여 生起하는 依他起相 pa rata n tr a -lak~ai;i a, 그리 고 一切法 의 平等 한 眞如 의 모습안 바 圓成質相 p ar i n i~p anna-lak~a i;i a 을 말한다. 三無自性 이란 三相에 各各 해당하는 진리로서 追計所執의 相은 自 性 s v abhava 이 없 다는 相無 自 性, 依他起相에 의 하여 生起하는 것 은 自性이 없다는 生無自性, 그리고 諸法이 본래 無自性이라는 勝義無 自性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이론은 모두 空, 죽 一切諸法皆無自性의 진리폴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解深密經』은 이렇게 空의 진리를 더 자세히 밝혔다고 하여 스스로를 佛陀의 가르침~ 充分히 드러 낸 了 義 n it죠 r t ha 經으로 간주하고 般若經典이 나 小乘經典은 不 了 義 ney ar t ha 經으로 본다. 따라서 『해심밀경』은 佛陀의 說法(轉法 輪 )에 三時가 있었음을 말한다. 첫번째 轉法輪온 聲聞乘울 위하여 四諦의 相을 說하였고, 두번째는 大乘에 나아가는 者들을 위하여 一切諸法無自性에 근거하여 隱 密의 相울, 그리고 세번째로 一切乘 에 나아가는 者믈 위하여 같은 一切諸法無自性에 의거하면서도 顯 了의 相을 說했다는 것이다. 顯了의 相이란 般若經典과 같이 諸法 의 實 相을 단지 空으로만 說하지 않고 이 空의 裏 面에 숨어 있는 相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解深密經』을 所依經 典으로 하는 法相宗에서는 이와 같은 說에 근거하여 小乘과 中觀과 諭伽를 각각 有와 空과 中을 가르치 는 哲學으로 敎相判釋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唯識經典으로서의 『解深密經』의 意義는 이러한 三相이나 三無自性 등의 이론뿐만 아니라 〈心意識相品〉이나 〈分別 玲 伽品〉과 같은 곳에 나타나 있는 識 v ijfi ana 의 이몬에서 발견된다. 〈心意識相 品〉의 心은 一切種子識으로서 阿頓耶識 ala y av ijfi ana 이 라 부른다.
이 識이 갖고 있는 種子의 發育에 의하여 身心環境의 世界가 전개 된다는 것이다. 아 識은 一切의 種子룰 執持하고 있고 우리의 감각 기관과 몸 등 一切를 유지하고 있기 대문에 執持識 adanav ijii ana 이 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우리의 日常的인 경험의 세계 를 아라야 識 의 顯現으로서 보는 것을 아라야識 緣起說이 라 한다. 그러나 『解 深密 經』에는 아직도 이 아라야識說이 唯識無境의 사상, 죽 대상세계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이론과 분명하게 직결되어 있지는 않고, 業報 에 의하여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業感綠起論的 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죽 아라야 識 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小 乘佛敎哲學에 서부터 계 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業 의 所在와 論廻 의 主體의 문제에 대한 決 定的인 答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 이 다. 〈心意識〉의 〈意識 mano-v ijii ana 〉은 정 신 적 인 현 상을 대 상으로 하 여 分別作用을 하는 識으로서 唯識哲學의 八識說에 서 第六識에 해 당한다. 『解深密經』에 는 아직 도 第七識죽 末那識 manas 의 개 념 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解深密經』에서 萬法唯識의 思想이 分明히 나와 있는 곳은 〈分別諭伽品〉으로서, 미독보살과 불타와의 문답 가운데서 불타는 다 음과 같은 要旨의 說法울 한다. 죽 三 摩 地 samadh i(三昧)와 昆鉢舍 那 v ip as yana( 觀)를 행 할 때 나타나는 影像은 心과 다를 바 없 다. 왜 냐하면 그 影像은 단지 識뿐이 므로 vij iiap ti-m atr a ; ide ati on -only 識 v ijii ana 의 所緣 alambana( 대상)은 단지 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뿐이 다. 이와 같이 影像과 心이 다룰 바 없다면 결국 心이 心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고서 얼굴의 影 을 본다고 말하지만 얼굴을 떠나 影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 과 마찬가지라 한다. 以上과 같은 影像의 唯識에 관한 說法에서 우 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唯識思想은 본래 止觀, 죽 요가 y o g a 의 修行 과 體驗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唯識哲學울 諭伽行 y o g acara 의 哲學이 라 부르는 것 이 다. 2 『阿昆達磨經 Abh i dharma-s iit ra 』 이 經은 現存하지 는 않지 만 唯識系統의 經으로서 중요한 것 이 었
음을 다른 문헌들을 동해서 알 수 있다. 特히 無著의 『攝大乘論』은 이 經의 『攝大乘品』을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經이 現存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經의 제목 자체가 말해 주듯이 매우 체계적이고 敎學的인 경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如來藏思想 系統의 經典 後期大乘經典둘 가운데서 唯識思想을 說하는 경전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部類를 형 성 하고 있는 것 은 如來藏 t a t hag a tag arbha 思想울 중 심으로 하는 경전들이다. 如來藏思想의 근본은 一切의 衆生들의 마 음은 본래 淸淨하여 누구나 다 修行을 하면 成佛할 수 있다는 것으 로서, 이러한 思想은 小乘經典들 가운데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다. 特히 우리가 이미 고찰한 대로 大衆部는 이것을 하나의 根本的 敎 說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思想은 大乘佛敎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어서 Ii'淮藥經』과 감은 大乘經典에서는 〈一切衆生怒有佛性〉이 라는 佛性의 思想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如來藏思想은 이와 같은 思想的 흐름의 結晶으로서 如來藏 계통의 경전들은 이 여래장의 개 념을 理論化하고 발전시킨 경전들인 것이다• 〈如來藏〉이란 말의 梵 語는
1 『大方等如來藏經』 如來藏思想系統의 經典 가운데서 제일 먼처 형성된 것은 『大方等 如來藏經』이다. 이 經은 一切衆生은 그 안에 如來룰 藏하고 있는 如來藏 t a t hag a t a g arbha 이 라고 한다. 如來는 智慧와 如來의 눈을 갖 고서 無景의 須f齒에 감싸여 있는 衆生들의 내부에 자기와 똑 같은 지혜와 눈을 가진 如來가 坐禪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진리를 듣고서 修行하는 보살은 번뇌로부터 해방되어 如來가 된다고 한다. 衆生 안에 들어 있는 如來륭 如來藏經은 〈如來智〉, 〈如 來知見〉, 〈如來法性〉, 〈如來의 種姓〉, 〈法藏〉,〈智藏〉, 〈如來身〉 等 의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이 如來를 藏하고 있는 衆 生의 모습을 〈시 들은 蓮華 중의 佛〉, 〈群蜂 중의 美堂〉, 〈貧賤한 女 子가 懷妖한 轉輪王〉 等의 9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비유는 人間온 누구나 다 如來가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不增不滅經』 이 經의 주요 내용은 衆生界가 곧 法界이며 衆生의 깨달음의 增 減에 관계없이 衆生界와 法界는 增減이 없다는 것이다. 이 衆生界, 죽 중생의 본질은 如來藏이고 如來의 法身이다. 그리고 이 如來藏 이 無量의 번뇌에 감싸여 있는 것을 중생이라 부르며, 世問을 멀리 떠나서 菩提行을 닦을 때에는 보살이라 부르고, 一切의 번뇌를 떠 나 淸淨해질 때에는 如來라 부른다고 한다· 『如來藏經』이 여래장을 衆生과 同一視하는 반면에 『不增不減經』은 여래장을 衆生界, 즉 衆 生의 본질(性 dha t u) 과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여 래장〉 의 뜻은 如來를 藏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如來의 精競, 혹은 法身 의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3 『勝皇經』 이 經의 주인공은 승만 Srim ala 夫人으로서 『維摩經』과 같이 在家 佛敎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승만경』은 法身이 번뇌에 의하여 감싸 여 있을 때를 如來藏이라 부른다고 한다. 여래장은 苦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菩提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래장에 不空如來i값과 空如來藏의 二義의 구별을 하고 있다. 前者는 如來의 智와 不可分 的인 여러 德性을 갖춘 여래장을 말하고 後者는 如來의 智와 거리 가 먼 번뇌가 본래적으로 없는 여래장을 의미한다. 4 『溫葉經』 이 經 의 주제는 佛陀가 入滅할 즈음에 임하여 埋紫에 드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은 方便에 불과하며 사실 如來는 常住不젖하는 法身이 며 열반은 常樂我淨의 四波羅密울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一切衆生 이 여래장이라는 사상을 『열반경』은 一切衆生이 佛性을 가지고 있 다는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一切衆生惑有佛性). 열반을 常, 樂, 淨 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승불교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我 a t man 의 개 념 을 적 용하는 것 은 無我 ana t man 說에 정 면으로 대 립 되는 것으로서 분명히 佛陀의 본래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思想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경』은 大乘의 法身思想과 佛性 論的 思想을 배경으로 하여 대담하게 열반을 〈我〉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파니샤드的인 사상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4 『梧伽經』과 『大乘起信論』 Ii'梧伽經』과 『大乘起信論』은 後期大乘經典둘 가운데서도 가장 늦 게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思想的으로도 이들은 아라야 識緣起說의 唯識思想과如來藏思想을 融和시키는특칭을 갖고 있다. Ii'傍伽經』은 443 年의 宋譯本이 있으므로 늦어 도 4 세 기 末頃에 는 成立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Ii'梧伽經』도 역시 아비달마 abh i dharma 的인 경전으로서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諸種의 大乘思想 둘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經의 내용이 번잡하고 때로는 相互牙循的이기도 하다. Ii'傍伽經』은 스스로의 중요한 내용을 五法, 三自性, 八識 二無我로 규정하고 있다. 〈五法〉이란 名 naman, 相 nim i tta, 妄想 vik a lpa , 聖智 samy a g -jiian a, 如如 t a t ha t료를 말하고, 〈三
自性〉이 란 妄想自性, 綠起自性, 成自性(分別性, 依他性, 眞質性)을 E 든 한다. 五法 中에서 名과 相은 妄想自性에 해당하고, 妄想은 綠起 自性, 聖智와 如如는 成自性에 상응한다. 〈八識〉은 아라야識, 意 manas, 意識 mano -vi ji 'iii.na 및 眼, 耳,鼻, 舌, 身의 五識을 말하고 〈二無我)는 人無我와 法無我몰 뜻한다. 『傍伽經』의 思想史的 意義는 무엇보다도 아라야識과 如來藏 t a t h ii.g a t a g arbha 을 同一視하는 데 에 서 발견된 다. 본래 아라야識은 生 死의 世界를 現成하는 妄識이었으나 『傍伽經』은 이것을 如來藏과 同一視하므로 諸法은 곧 여래장의 顯現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 아라야識緣起說이 如來藏緣起思想으로 바뀌 게 된 것 이 다· 이 經의 비유적인 설명대로 깊은 바다와 그 위의 물결은 결국 같은 것으로 서 生滅의 世界 自體가 곧 眞如의 나타남이라는 사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梧伽經』은 아라야識이 단순히 自性淸淨心인 如來 藏이 아니라 眞妄和合의 二重性을 가지고 있음도 누차說하고 있다. 위 와 같은 『梧伽經』의 思想과 軌를 같이 하여 如來藏緣起 혹은· 眞如緣起몰 論하고 있는 것이 『大乘起信論』이다. 『起信論』은 眞如 와 生滅울 같은 一心(衆生心)의 兩面으로 본다. 一心法界의 無差別 相은 眞如이 며 一心法界의 差別相은 生滅의 世界인 것 이 다· 이 差 別相으로서의 一心法界(心生滅)가 곧 如來藏自性淸淨心이며 아라야 識이라고 한다. 아라야識은 生滅과 不生滅이 和合하여 非一非異~ 양상이 며 淨과 染, 覺과 不登을 포함하는 眞妄和合의 識이 라고 『起 信論』은 말한다. 아라야識의 不梵에 의 하여 染緣起인 隨緣流轉의 生死의 세계가 전개되며, 아라야識의 礎으로 인하여 淨緣起인 反流 還滅의 淮藥의 世界가 可能한 것이다. *참고문현 Hakeda, Y. S., tra ns., The Awakenin g of Fait h. New York, 1967. Lamott e, E., tra ns., Sandhi1 1i rmo canasutr a , L'Exp lica ti on des my s - ter es. Louvain and Paris, 1935. Ruegg , D. S., La the orie du ta th i i ga ta g a rbha et du go tr a . Paris, 1969.
Suzuki, D. T. , Stu d ie s in the Laiz k i'i va ti' ira Su tra . London, 1930. , tra ns. , The Liz k avati' ira Sutr a . London, 1932. Waym an, Alex & Hide ko, tra ns., The Lio n 's Roar of Qu een Sr'im i' ila : A Buddhis t Scrip tur e on the Tath i 'i ga ta g a rbha Theory. New York, 1974. 平川, 琉 山, 高崎編 , 『如 來藏思想』 , 『講座 • 大 乘佛敎 』 6. , 『唯識思想』, 『講座 • 大乘佛敎』 8. 宇井伯壽, 『大乘佛典 O 硏究』, 『佛敎經典史』 ' li'3)Y性論硏究』 , 譯誌 * 乘 起信 論 』 高崎直道 , 『如來藏思想 0 形成』 平 ]|l 彰, 『大乘起 信論 』 『佛典 講 座』 22.
제 13 장 瑠伽行哲學 1 諭伽行哲學의 傳統 諭伽行哲學은 中觀哲學과 더불어 印度의 大乘佛敎哲學의 兩大山 脈을 이루는 哲學이다. 諭伽行哲學은 龍樹에 의하여 확립된 中觀哲 學의 眞理에 대한 否定的 接近方式에 만족하지 않고, 空思想을 받 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론을 전개한다. 우리가 日常的으로 經驗하는 事物들이 自性이 없이 정녕 空이며 순전히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構想되거나 造作된 것이라면, 결국 이들 事物들은 우리의 識 v iji'i ana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렇다면 이 識을 떠나서 그들이 客觀的 實在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 며, 꿈에서와 같이 그들은 오히려 意識의 投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다. 이 와 같은 관점 아래 諭伽行哲學은 存在를 認識으로 還元하~ 哲學울 전개한 것이다. 諭伽行哲學의 根本思想은 우리가 前章에서 고찰한 經典둘, 特히 『解深密經』에 發見되지만, 그것이 組織的으로 體系化되어 학파~ 이루게 된 것은 서력기원 4 세기 初의 인물로 추정되는 彌勒 Mait re y a (약 270~350 년경 ) 尊子로부터 이 다. 그는 『諭伽師地論 Yog a carabhii - m i』’ 『大乘莊嚴經論 Maha y anas iit rala ril kara 』, 『中邊分別論 Madhy a nta - v i bha g a 』, 『法法性辨別論 Dharmadharma 沮 v i bhan g a 』’ 『現觀莊嚴論 Abh i- sama y ala ril kara 』, 『金剛般若經釋論(七十碩) Kar i ka-sa pt a ti』 등의 중요
한 論書둘을 처 술했 다. l) 『兪伽師地論』은 諭伽行哲學의 기 본서 로서 『瑠伽師地論』이 라는 이 름은 이 책 의 처 음의 〈本地分〉에 서 요가行者 가 수행해야 하는 17 개의 명상단계를 설명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서 諭伽行 Yo g acara 이 라는 말도 여 기 서 유래 한 것 이 다. 2) 『兪伽論』 은 唯識思想과 如來藏思想에 입각해 요가의 수행에 철학적인 기초 룰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唯識說은 요 가의 수행이라는 실천적 기반을 가졌다는 점이다. 〈攝決擇分〉에는 아라야식의 존재의 증명과 그 성격을 규정하며 阿頓耶識 綠起說 에 입 각한 唯識思想이 취 급되 고 있 다. 『大乘莊嚴經論』, 『中邊分別論』, 『法法性辨別論』은 유식 사상을 조직 적 으로 설 명 하는 論書둘이 다.
1) Ti be t 傳統 에 의 하면 Ma it re y a 는 『究克 一 乘쨌性論 Mah 5.y ana-u tt ara t an t ra- 읊 s t ra 』도 썼 다고 한다. 2) 〈恥伽師〉란 말은 玄裝이 〈y o g죠 cara 〉라는 말을 〈y o g aca ry a 〉라고 誤睦. 하여 번역 한 데서 由來한 것이다.
彌勒尊子의 뒤를 이어 유식사상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無著 Asang a (310~390 년) 과 그의 동생 世親 Vasubandhu 이 다. 無著온 처 음 에 소승교단에 출가했으나 나중에 미륵존자를 만나서 대승불교로 전향했다고 한다. 그의 처서로서는 『順中論』, 『 顯揚聖敎論』 , 『大乘 阿昆達磨集論』, 『攝大 乘論 』 등이 있으나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은 『攝大乘論』이 다. 『攝大乘論 M~ha y ana-sam g raha 』은 『大乘阿昆 達磨集論 』이나 彌勒의 『大乘莊嚴經論』에 의거한 論書로서 唯 識 哲學 에 입각하여 대승불교의 독성을 10 개 항목으로 논하는 체계적인 처 술이 다. 첫 째 항목은 〈所知依分〉으로서 앎의 대 상, 즉 諸法이 依持 하는 바로서의 아라야識 ala y av ijii ana 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所知 相分〉으로서 諸法의 實相 인 三性說 t r i svabhava 을 論하고 있다. 죽 通計所執性 pa rik a lpi ta- svabhava, 依他起性 pa rata n tr a -svabhava, 圓成 實性 p ar i n i wanna-svabhava 의 三性이 다. 세 째 항목은 〈入所知相分〉 으로서 唯識 v ijii a pti -ma t ra t a 의 진 리 에 들어 가는 實錢을 다루며 , 네 째 〈彼入因果分〉은 들어감의 因과 果로서 보살의 六波羅密多에 관 한 章 이다. 다섯째 〈彼修差別分〉은 위의 修行의 等級으로서 보살의 十地 dasabh iimi를 論한다. 여 섯 째 〈增上戒學分〉은 위 의 修 行 가운데 서 보살의 戒律에 관하여 논하며 일곱째 〈增上心學分〉은 보살의 禪
定을 다룬다. 여덟번째 항목은 〈增上慧學分〉으로서 無分別智 nir v i- kal p a- jii ana 의 修行을 취 급한다. 아홉째 는 〈果斷分〉으로서 이 상의 修 行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보살의 無住處淮藥을 논한다. 無住處淮築 이란 小乘의 열반과는 달리 보살둘이 얻는 열반으로서, 모든 須腦 klesa 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는 하나 生死의 世界와 絶斷되지 않 고 慈悲 가운데서 모든 衆生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의 열반을 말한다. 마지 막으로 『攝大乘論』은 〈彼果智分〉에 서 {j h 의 三身 tri k a y a 을 論하고 있다. 唯識思想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所知 依分〉과 〈所知相分〉이 며 나머 지 는 修行과 그 결 과에 관한 것 이 다. 2 世親의 唯識哲學 彌勒尊子와 無著의 唯識思想울 더욱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사 람은 無著의 동생 世親 Vasubandhu 이 었 다. 그의 年代에 관하여 는 논 란이 많으나 대략 4~5 세기의 人物로 추정된다 .3) 世親도 역시 처음 에는 소승을 공부하여 『供舍論』과 같이 小乘敎學의 名著을 냈지만 그의 형 無着의 영향을 받아 대승으로 轉向하였다고 한다. 그는 彌 勒과 無著의 대부분의 처서들에 주석을 썼으며 『法華經』, 『無量壽 經』, 『十地經』 등의 대승경전의 해석서도 썼다. 한편 독자적인 저 술로서 『大乘成業論』, 『佛性論』, 『唯識二十論』, 『唯識三十碩』 등을 처 술했으며 , 『唯識二十論 V i msa ti ka 』과 『唯識三十碩 Tr i ms i ka 』은 그 의 유식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서로서 唯識哲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처서들이다. 따라서 이 두 論을 중심으로 하여 唯識哲學의 근본을 살펴 보기로 한다.
3) 이 문계 에 관하여 S. Dutt , Buddhis t Mo11ks a11d Monaste r ie s of India 唯(L識on論do師n, 世1親962과) p同p.一 2人80인~8가5 참아조니. 면 운同재名 의二 人핵 인심 가은이 『 다供.舍 論여g 기의 서 는著 者前 者世뮬親이 따 온大다乘.의
識 vij iian a 혹은 心 citt a 의 重要性은 처음부터 불교사상에서 인정 되어 왔다. 識은 五薩 가운데 하나이고, 十二支緣起說에서 第三의 요소로서 人間의 輪廻과정 속에서 前生과 後生을 이어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阿含經典에도 〈心은 法의 根本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4) 또 〈心이 더럽기 때문에 衆生이 더럽고, 心이 깨끗하기 때문 에 衆生이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5). 또한 相應部經典 Samy utta N i ka y a 에 도 〈世間은 마음에 의 하여 이 끌리 고 마음에 의 하여 腦亂되 나니, 마음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從屈시킨다〉 6) 라는 말을 찾아 볼 수가 있다 .
4) 『大正新修大藏經』 Vol. 1, p. 827b, 〈心爲法本〉 5) 『上同』, p. 69c, 〈心腦故衆生腦 心淨故衆生淨〉 6) Mrs. R. David s , tra ns., The Book of the Ki nd red Say ing s (Samy 11t ta- Ni kii y a) , Part I, p. 55 :
우리가 이미 고찰한 대로 經量部의 哲學에서는 一味羅이라 하여 一 種 의 미세한 識을 種子識으로 삼아 윤회의 主體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뿐만 아니라 『華嚴經』의 〈十地品〉가운데도 三界唯 心의 사상, 죽 이 세계는 오로지 心 citta, v ijii ana( 識)뿐이 라는 사상 이 발견되는 것도 언급했다. 唯識哲學온 이러한 깊은 뿌리를 가진 사상으로서 『解深密經』, 彌勒, 無著 등에 의한 이론적 발전을 거쳐 서 世親에 와서 일단 그 絶頂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선 世親의 學說을 논하기 전에 〈唯識〉이 라는 말부터 明確히 해 둘 필요가 있다. 〈唯識〉에서 〈識〉이 란 梵語로 〈 v iji'i ana 〉나
rep re senta t i on , i dea ti on 을 의 미 한다. 이 때 의 〈 唯識 v ijii a pti ..: m 료t ra t a 〉 이란 唯識無境, 죽 우리가 보통 인식의 대상( 境 )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表 象 뿐이라는 主 觀 的親 念論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 唯 識 〉의 보다 일반적인 뜻 이 다. 그러 나 이 상과 같은 〈 v ijii ana 〉 와 〈 v ijii a pti〉의 區 別은 언 제 나 明確한 것은 아니다. 世親의 『唯 識 二十 論 V i msa ti ka 』은 주로 해 서 唯識無境 을 해 명 하는 논서이다. 만약에 事 物둘이 우리의 표상이나 관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사 물 의 時 間的 空間 的 區 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同一한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에 따라서 취하는 성공적인 행위 들 을 설명하겠 는가라는 질문으로 『唯 識 二十 論 』은 시작한다. 世 親 은 이 문재 물 꿈 의 현상에 비교하여 대답한다. 즉 꿈과 같이 깨어나고 보면 허망한 것에서도 우리는 위의 네 가지 현상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현 상들은 결코 外境의 實 在性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惡 業 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거기서 지옥의 문지기들을 보는데 문지기들은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는고로 客觀 的인 存 在일 리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지옥에 . 가는 자들의 나쁜 業 의 결 과로서 나타나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業 이 남긴 힘 혹 은 習 氣 vasan 료란 識 안에 존재하는 것인 반면, 사람들은 業 의 결과는 識 밖 에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으며 따라서 행위의 習 氣 나 결과도 모두 識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世親온 주장한다. 佛陀가 마치 認 識 에 內的 그리고 外的 根 操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衆生의 敎化를 위한 것이며 사실은 認識은 識 自 體 의 種 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主 體 (自我)와 客 體 는 다 識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아다. 『唯識二十論』은 주로 唯 識 無境에서 〈無境〉의 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論은 어떻게 客觀的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존 재 하는 것 처 럼 보이 는가라는 唯識 v ijii a pti -ma t ra t a 의 구체 적 메 카니 즘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唯識의 理論울 전개한 것이 世親의 『唯 識三十碩 Tr i ms ik a 』이 다.
이 論의 初頭에서 世親은 唯識說의 핵심을 一頭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提 此能變 唯三 atm adharmop a caro hi viv i d h o ya Q pr avarta t e vij fian ap a rii; iam e 'sau pa ri i;iam aQ sa ca tri v i d h a 이것을 번역하면 : 〈我와 法과 같은 種種의 假說은 識의 轉變에 依하나니, 이 轉變은 三種이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我 a t man 와 法 dharma 은 主體와 客體의 世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순전히 假說 up a cara, 즉 方便上 임시로 設定된 개념들로서 無知로 인한 妄分別의 所産 p a ri kal pit a 이 라는 뜻이 다. 그리 고 이 러 한 我와 法아 라는 허 구적 인 존재 는 識 v ijii ana 의 轉愛 p ar ir:i ama 에 의 거 하고 있 다 고 한다. 여기서 우선 唯識哲學온 種種 의 假說을 단지 허구나 空이 라고만 하지 않고 그러한 非存在들이 識이라는 어떤 存在에 의거하 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能後의 識에 는 三種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唯識의 八 識說 에 접한다. 識 의 第一韓젖에 의 하여 第 八識인 阿頓耶識 alay a vij iian a 혹은 異 熟識 이 成立한다. 〈아라야 ala ya 〉라는 말은 藏 , 죽 창고라는 말로서 이 識 이 그 안에 業 에 의 하여 薰習 된 習氣 v료 sana , i m p ress i ons 둘을 種子 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藏識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혹 은 우리의 業의 結果(V.~ I v ip aka) 라고 히여 異熟識 이라고도 불리 며 ,7) 나머지 모든 識둘의 根本 이 되기 때문에 根本設 이라고도 한 다. 이로부터 다른 모든 識둘 이 마치 大 海上 의 波浪과도 같이 轉젖 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라야 識 의 轄袋 이란 아라야 識 안에 처 장되 어 있는 種子들이 發茅하고 成熟하여 나타나게 되 는 諸識의 分別作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다품아닌 우리의 日常的 經險 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라야識內에 潛在 해 있던 種 子둘이
7) 〈異〉란 말은 우리의 行爲는 ;;r; • 惡의 구별이 있지만 果f 8 로서의 아라야 謀 자체는 非,;ff- • 리 1 : 惡의 無記로서 異類 입 운 나타내는 알이다.
現勢化하여 나타나는 識둘을 轉識 p ravr tti -v ijii ana 이 라 부르며 이 와 더불어 現象世界가 나타나는 것을 現行이라 한다. 主體와 客體, 認 識하는 者와 認識되는 것, 身體와 環景 , 이 모든 것이 아라야 識 의 轉幾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顯現 된 세계에 근거하여 우리는 業을 짓고 業 은 또다시 種子들을 薰習하 여 阿頓耶識에 처장되게 된다. 어떤 種子들 은 현현되지 않고 종자로서 남아 있으면서 서로 自流相紹울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계들을 말하여 唯識學에서는 〈種子生現行, 現行薰種子, 種子生種子〉 라 한 다. 阿 頓 耶 識 은 흐르는 물과 같이 항시 변천하면서 輪廻 의 主體룰 이루는 存在이다. 아라야식은 항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구 제적인 인식작용도 하지 않는다. 아라야식 자체는 傾腦 에 덮여 있 지도 않고(無 昭) 善 과 惡에 대하여 中性的인(無記) 존재이나, 아라 야 識 內에 있는 種 子둘은 善惡 의 구별 이 있 다고 한다. 아라야 識 의 活動과 함께 第七識인 末那識 manas 도 작동하게 된 다. 이 것 이 識 의 第二轉이 다. 末那識은 思量 manana 을 위 주로 하는 思 盤識 으로서 아라야 識 을 대상으로 하여 我執을 일으키며 항시 我 見 atm a -d r! !ti , 我擬 atm a -m oha, 我漫 atm a-mana, 我愛 a t ma-sneha 의 四傾 1 齒를 동반한다고 한다. 상키 야哲 學 에 있 어 서 아함카라 ahamkara 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마나 識 은 아라야 識 과 같이 자나깨나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識으로서, 나머지 여섯 가지 識들에 統一性 을 부여하고 그들의 활동의 前提가 된다. 다른 여섯 가지 識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중지하지만 마나識은 끊임없이 활동 하면서 인간의 정신활동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深層的인 識 인 것이다. 第七識의 활동에 따라서 아라야 識 의 轉識 인 나머지 六識도 作用 울 하게 된다. 이것이 識 의 第三轉發인 것이다· 六識은 眼, 耳, 鼻 , 舌, 身, 意 의 六根에 의 존하여 各各의 대 상을 了別 v i !)a y a-v ijii a pti하 기 때문에 了別境識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서 처음 五識은 오직 각 각의 감각기관에 現存하는 대상들만을 아무런 思唯나 分別도 없이 知梵하는 데 비하여 第六識인 意識 mano-v ijii ana 은 精神的 현상들 (心所法들)분만 아니라 五 識 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상들에 대하여도
分別과 執着을 한다· 그 뿐 아니 라 意識온 現存하지 않는 대 상에 까 지도 관여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회상하기도 하며 아무런 대상이든 想像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唯識學에서는 意識 이 五識과 함께 生起할 때를 五供意識이라 부르며 意識이 그 自體 만으로 단독으로 生起하는 경우를 獨頭意識이라 부른다. 이상과 같은 三種의 識轉윗에 의하여 萬法이 顯現한다는 것이 唯 識 v ijii a pti -rna t ra t a 의 理論이 다. 그러 나 이 唯識의 진 리 를 모르그 L 사람들은 我와 諸法에 대 한 妄分別 v i kal p a 을 하고 執着을 하게 된 다는 것 이 다. 이 것 을 事物의 過計所執性 pa rik a lpi ta- svabhava, 죽 妄 分別된 모습이 라 부른다. 오직 識 vij iiap ti 분인 것을 객 관적 으로 實 在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妄分別하는 識의 作用 자체들도 아라야識의 種子에 의존하는 依他的 存在인 것이다. 이것 을 依他起性 pa rata n tr a -svabhava, 죽 他의 因緣에 의 존하는 모습이 라 부른다· 그러나 바로 諸識의 依他起性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識의 本性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差別性과 主客의 分 別과 對立울 초월한 眞如 tat h ata 그 자제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圓成實性 p ar i n i wanna-svabhava 이라 부른다. 依他起性과 圓成實性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한다. 依他起性을 바로 깨달으면 圓 成實性을 깨닫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過計所執性에 빠지기 때 문이 다. 이 三性 t r i svabhava 의 진 리 를 다른 각도에 서 볼 것 같으 면 三無 自 性 tri v i d h a n il;l svabhava t a 이 된 다· 三性의 개 념 이 中觀派 의 부정적 空思想을 넘어서서 實在親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면, 三無自性은 空의 다른 표현이 된다. 죽, 分別된 相둘은 空하기 때문에 相無自性이요, 緣起에 의하여 生起한 것은 空하기 때문에 生無自性이요, 諸法의 質相이 본래 空이기 때문에 勝義無自性인 것 이다. 諭伽行哲學도 說一切有部와 같이 諸法을 五位로 분류한다. 그러 나 有部의 75 法 대 신 100 法울 든다. 물론 諭伽行哲學은 唯識思想에 입 각하고 있기 때문에 諸法을 有部와 같이 實在的으로 보지 않고 識의 構想으로 불 분이다. 그러나 修行의 목적을 위하여 諸法의 구 별과 분류는 의미있는 것이다. 100 法은 心法의 8 개(죽 8 識), 心
所法의 51 개 , 色法의 11 개 , 心不相應行法의 24 개 , 無爲法 의 6 개 로 되어 있다. 〈兪伽行 y o g acara 〉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唯識의 哲學은 단순히 이론적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가의 修行을 통한 경험에 의거 한 것이다· 요가의 단계가 깊어짐에 따라 瑠伽行者는 唯識의 전리 를 깨 달아 主體도 客體도 사라져 버 린 상태 에 도달한다· 모든 執着 과 迷妄으로부터 해방되며 그의 人格의 深層 , 즉 아라야 識 내에서 一種의 轉換이 일 어 나게 된 다고 한다· 이 것 을 轉依 asray a -pa ravrtt i 라 부른다. 아라야識에 있는 有漏種子는 無漏의 種子로 바뀌게 되 며 須t齒가 바뀌어 淮藥을 證得하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현 Jac obi, H., tra ns., TriT {lsi k i i vi j nap ti des Vasuba11dlzu mi t Bhii~ ya de s Acii ry a Stl zi ram att '. Stu t t ga rt, 1932. La Vallee -Po ussin , L. de, tra ns. , Vi jnap timi itra ti isi d d hi, La Si dd lzi de Hit tan -Tsang . Paris, 1928-1929. Lamott e, E., tra ns., La Somme dtt gr ands velzic u le d'Asait ga (Malzii - yiina -samg r alza) . Louvain , 1939. Levi, S., tra ns., Mahii yiina -sutr iila mkii ra , exp o se de la doctr i n e du Grand Vehic u le selon le sys t e m e Yog iicii r a . Paris , 1907-1911 . , tra ns., Mate r ia u ::c po ur I'Etu d e du Sy st e m e Vi jnaP t imi itra . Paris , 1932. Masuda, J., Der iud iv i d u ali sti s ch e Ideali sm us der Yog iicii ra -Schule; Versuch ein e r ge neti sch en Darste l lung . Heid e lberg, 1926. Schott , M. , Sein als Bewussts e in : ein Beit ra g zur Mahii yiina -Plzil o so-Phie . Heid e lberg, 1935. Wolf f, E., Lehre vom Buwussts e in . Heid e lberg, 1930. 水野弘元, Ii'.,.~ !) 佛敎在中心& L t.:佛敎 0 心 識論』 勝又俊敎, 『佛敎t드卞낡乙心 識說 0 硏究』 鈴木宗忠, Ii'唯識哲學槪說』 , 『唯識哲 學 硏究』 宇井伯 壽 , 떄 計伽論 硏究』
, 『攝大乘 論硏究』 , 『大乘萩嚴經論硏究』 , 『 四 譯對照唯識二十論硏究』 , 『安慧 • 設法唯識三十碩擇論』 山 口 益 譯社 , 『中꿇分別論釋疏』 結城令 n 月, 『世親唯 識 0硏究』
제 14 장 世親 以後의 唯識哲學 1 陳那와 佛敎 認識論 唯識無境을 주장하는 唯識哲學은 자연히 認識의 문제를 佛敎哲學 의 근본적인 관심사로 만들었다· 유식철학에서는 결국 存在論이 認 識論이요, 認識論이 存在論인 것이다· 認識의 문제에 관한 관심은 世親의 哲學울 계승한 陳那(Dig na g a; 5~6 세기)에 와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 체계적인 佛敎認識論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陳那의 著書로는 『觀所綠論 Alambanap ar 1k~a.!I , 『圓集要義論 Prajf iap a rami ta- piI;lQ ar t ha-sam g raha 』' Ii'掌中論 Has t avala p rakara i:i a 』, 『集量論 Pramai:i a - samucca y a 』이 있다. 『觀所緣論』은 唯識의 立場에 서서 認識의 대상 을(所綠) 논하고 있고, 『圓集要義論』은 『小品般若經』의 空思想울 通 計所執性, 依他起性, 圓成實性의 三性에 의 하여 해 석 하는 논서 이 다. Ii'掌中論』은 外境이 란 識의 所現이 며 三界는 假名뿐이 라는 것 을 論한다. 마치 사람들이 밧줄을 보고서 뱀 이 라 착각하듯이 外界 가 虛妄한 것을 모르고 實有로 妄執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 다. !東那는 『掌:中論』과 『集 量論 』에 서 이 와 같은 唯識無境의 說을 뒷받침해 주는 特有의 認識論을 전개하고 있다· 陳那 당시에는 이미 印度의 各哲學學派들은 자기들의 形而上學的 견해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認識論的 省察에 의하여 더욱 공고히 다지는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 가운데서 存在 論 을 認識 의 문제로 대치한 唯 識 哲學이 認識論 에 至大한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陳那는 唯 識哲 學 뿐만 아니라 佛敎의 근본적 세계관인 無我와 無常의 진리를 인식 론적 으로 옹호함과 동시 에 正理學派와 미 망사 Mi m amsa 哲 學 의 이론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에 응하여 正理學派의 웃됴타카라 Udd y o t akara 는 그의 『正理評 釋 N y료y a-var tti ka 』에 서 正理哲 學 의 입 장 을 옹호했으며 陳 那의 說을 반박했다. 佛敎측에서는 法稱 (Dharma kir t i ; 7 세 기 )가 나와서 陳 那의 認 識 論 및 論理學을 더 욱더 조직 적 으로 발전시 킬 뿐 아니 라 『 集量 論』의 주석 서 인 『 量 評釋 Pramai;i a- var tti ka 』에서 웃됴타카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미망사 學 派의 이 론도 공격 하여 미 맘사의 구마릴 라 브핫따 Kumarila Bhatt a 는 그의 Sloka-var tti ka 에 서 이 에 응수했다. 한편 9 세 기 의 바챠스 파티 미 슈라 Vacas p a ti m i sra 는 그의 『正理評釋解駐』에 서 陳那와 法稱 의 이론을 비판하며 正理哲學의 입장을 옹호했다. 正理, 미망사, 베단타 等 의 정통학파들의 도전하에 불교인식론을 끝까지 옹호한자 는 8 세 기 의 샨타락시 타 Santa raksit a 寂護와 그의 계 자 카말라쉴 라 Kamalas ii a 였 다· 前者는 『 眞 理網要 Ta ttv asam g raha 』를, 그리 고 後者 는 이에 대한 주석서를 써서 웃됴타카라와 구마릴라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학파들을 論破하려고 하였다. 결국 그들은 티벳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인도불교에 있어서 마지막 巨匠들 이 되었던 것이다. 陳 那에 있어서 시작된 佛敎와 正統 바라문哲學 學 派들과의 논쟁은 인도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홍미있고 중요한 는 쟁 중의 하나였다.1) 이제 陳那와 法稱의 說울 중심으로 하여 佛 敎 認識論 의 대 강을 살펴 보기 로 한다.
I) 正理哲 學 과 陳 那에 의 하여 대 표되 는 佛 敎哲 學 과의 論 爭에 관하여 B. K. Ma til al 의 1:!_ist e_ ': _ Ullo g y, __I, _o g ic, and Grammar in India n Phil o sop h ic a l Analys i~ (The Hag ue , 1971) 참조.
본래 불교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佛陀 자신으 로부터 비롯하여 오직 知 登 p ra ty ak11a 과 推論 anumana 만을 인식의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해 왔다. 이것은 陳那와 法稱에 와서도 마찬 가지로서 그들의 認 識 論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佛
敎認識論은 지 각에 관한 이 론과 추론에 관한 이 론 의 두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 이 가운데서 推論에 관한 이론은 곧 因明學 he tu vid y a 이라 불리는 佛敎論理學인 것이다. 우선 陳那와 法稱 에 있어서 知 梵에 관한 이론부터 먼처 고찰해 보자. 지각의 문제를 둘러싸고 안도철학에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대립 되는 이론이 있다. 하나는 無形相認識論 n i rakara-vada 이요, 다 른 하 나는 有形相認識論 sakara-vada 이 다. 무 형 상인식 론이 란 우리 가 外界 의 事物 울 인식함에 있어서 감각기관에 의하여 지각되는 形相 akara 은 外部의 대상들 자체에 속한 것이며 지각활동은 그 형상을 반영 하는 것뿐이라는 이론이다· 正理 學派 나 勝論哲學에서는 지각이란 自 我 료t man 가 내 적 , 외 적 감각기 관을 동하여 대 상 ar t ha 과 접 촉하는 것을 의미하며, 說一切有部에서는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접촉을 말 한다. 이에 반하여 유형상인식론은 지각이란 客親的 世界몰 직접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知登 像 만을 상대로 인식한 다는 것이다. 죽 내부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表象들 만에 관계한다 는 이론이다. 經量部와 唯識哲 學 온 이러한 이론을 따른다· 그러나 經 量 部가 외적 대상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반면에 唯識哲學은 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經量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지각 은 대상을 칙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속에 주어지 는 像들에만 관여하지만, 이 像 의 나타남의 근거로서 외부세계 를 추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陳那뮬 중심으로 한 불교인 식론자들은 한편으로는 唯識無境의 思想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인식이돈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經景部 의 學說 을 方 便上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또한 經量部 에서 강조하고 있는 諸 法의 순간성에 입각하여 知 登 과 推論의 區 別울 더욱더 날카롭게 했다. 지 각이 란 陳那에 의 할 것 같으면 事物 의 순간순간 不斷히 幾 하고 있는 그대 로의 모습인 自 相 svalak!_;a i:i a 을 직 관적 으로 포착하는 것으 로서, 어떤 개념적 판단 v i kal p a 도 개입되지 않는 인식의 양태이다. 推論은 이와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
적 인 인석 양태로서, 사물의 普返相 s 료 man y alak~a i:i a 을 내용으로 하여 悟性의 개 념 적 構成 kalpa na 혹은 판단작용에 근거 한 것 이 라고 한다. 自相이란 直競像이고 普過相이란 마음에 의하여 구성되고 分別되는 관념 혹은 개념인 것이다. 직관상이란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사 물의 質在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느러내는 것임에 반하여 普通相이 란 이러한 言 表될 수 없는 流動的인 實在롤 言語와 悟性의 分別作 用 v i kal p a 에 의하여 固定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分別作用에 의하여 순간적인 것들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사물들을 實體化하여 어떤 不 裝 하고 安定된 것으로 착각하며, 그러한 人爲的이고 거짓된 세계에 安住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순간순간 변하고 있 는 불꽃의 양태들을 보면서 〈불꽃〉이라는 하나의 추상화된 개념으 로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각이란 바로 이 런 言 語 나 悟性의 활동에 의 한 構成 kal p ana 을 떠 나서 순수하게 力 動的인 實在에 순간적으로 接하는 인식행-위이다. 불교인식론은 따 라서 正理哲學과는 달리 知 1 장의 두 . 종류, 죽 無分別的 nir v ik a lpa 지 각과 分別的 savik a lpa 지 각의 구별 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分別的 지 각이란 이미 言語와 思考作用이 개입된 것으로서 力動的인 實在룰 포착하지 못하는 것 이 다. 陳那는 이 상과 같은 認識理論에 의 하여 言語의 意味에 관한 독특 한 견해를 폈다. 陳那에 의하면 말이란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構成 된 人爲甘9 인 것으로서 普週의 世界를 지칭하기 때문에 결코 순간적 特殊둘의 연속인 實在의 세계를 지칭할 수가 없다. 實在란 言語의 彼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陳那에 의하면 言語는 간접적인 방식 으로 實在를 드러낸다고 한다. 죽 개념이나 이름은 相對的인 것으 로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는 그 개념은 그것과는 다른 모든 개 념 을 排除 ap oha 함으로써 간접 적 으로 한 特殊한 事 物을 지 칭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事物을 〈소〉라고 할 때는 그 것은 〈말〉 아닌 것, 혹은 소 아닌 어떤 것이 아닌 것임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普通的인 개념을 特殊한 事 物의 지 칭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言語의 用法 은 결국 推論에 의거한 것이다.
陳那는 이 렇 게 知登 p ra ty ak~a 과 悟性的 構成 kal p ana 과를 일 단 確 然하게 구별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 所與와 悟性的 構成과의 종합에서부터 오는 知識을 설명하기 위하여 兩者 사이에 어떤 中間 的 혹은 媒介的인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所謂 精 神的 知梵 manasa-pr a ty ak ~a; menta l sensa ti on 이 라는 것 을 말한다. 정신적 지각이란 내적 감각기관인 意根 manas 에 의한 지각, 즉 意 識 man o-v ij nana 의 활동으로서 , 우리 가 외 적 감각기 관을 동해 서 어 떤 순간적인 대상을 순간적으로 捕提한 바로 다음 순간에 주어지~ 지각이라 한다· 그러나 이 지각도 역시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지식 p raty ak~a 의 一種으로 간주하며 개 념 적 인 간접 적 지 식 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고 한다. 陳那와 法稱에 의하면 識轉變에 의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認느 識은 自意識 svasamvedana 을 수반한다· 모든 意識온 同時에 自意識 이며 우리의 앎온 스스로를 비추는 自明性 sva y am p rakasa 을 지니고 있다. 마치 등불이 .:::.z.. 自體를 비추기 위하여 다른 또 하나의 등불 이 필요없듯이 지식이란 스스로를 드러내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 따라서 陳那에 의하면 知礎的인 知識에 있어서도 지각하는 主~ (gr 탸 aka-akara; 見分, 能取, 能墓)와 지 각되 는 마음의 對象(g rah y a akara; 相分, 所取, 所盛)과 더불어 認識의 自己認識이라는 第三의 요소가 認識의 結果(p rama i:i. a- p hala, svasamvit ti; 敷果 自證分)로서 주 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陳那가 주장하는 認識의 三分說로서 識의 轉變에 의하여 일어나는 認識의 構造몰 밝히는 이론인 것이다· 인 식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識이 세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는 이~ 이다. 이러한 理論에 있어서는 인식의 對象은 인식의 行爲 안에 內
在하여 있고, 인식의 行爲는 인식의 結果와 一致하는 것이다· 인식 의 결과, 곧 自證分을 떠나서는 어떤 인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다. 이렇게 되면 결국 存在하는 것은, 인식의 결과 죽 自證分으로. 서의 인식의 현상분이고 별도로 인식의 主體와 客體가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그리고 이 自證分은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識일 뿐이며 영혼이나 自我 a t man 에 속한 속성이나 상태가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自證分의 인식론은 唯識思想에 입각해서 存在롤 하나의非人 格 的인 認 識 現 象 으로 還 元 내지 解體시켜 버리는 哲學이라 할 수있다. 이 상과 같은 陳那의 認識論 은 正理나 미 망사 M i mamsa 와 같은 質 在 論 的인 哲 學 의 인석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正 理 哲 學 의 認識論 에 의하면 인식이란 自我 a t man 의 행위로서, E정 훈造 의 主 體 a t man 와 對象 과 手 段 (외적, 내적 감각기관)과 結 果 는 모두 별개의 요 소들인 것 이다· 그리고 인식의 自 意識 (自 證 分)이란 內的 감각기관 인 意根 manas 이 인식이라는 自我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인식 하는 행 위로서 그 自 體 가 또 하나의 自我의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 이다. 陳 那는 世 親 의 唯 識 思想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많은 唯 識學 者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哲 學 은 無 性 (5~6 세기), 獲 法 Dharmap a la (6 세 기 전반), 戒 賢 S il abhadra(6~7 세기)에 의하여 대대로 계승되었다. 無性 은 『 攝 大 乘論釋 』을 저술 했 으며 陳 那의 認 識의 三分說을 계승했 댜 護 法은 『唯 識 二十 論 』 및 『唯 識 三十碩』에 許 釋 을 썼으며, 그는 自 證 分 이외에도 그 것 을 의식하는 또 하나의 의식으로서 證自證分 을 세워 四分說울 주장했다. 護 法의 『唯 識 三十 碩 』에 대한 해석은 그의 제자 戒 賢 을 통하여 唐나라의 玄 !1$! (600~664) 에 소개되 었다. 玄 換 은 이에 근거하여 『成唯 識論 』을 번역하여 東아시아 불교의 唯 識 哲 學 연구에 至大한 영향을 끼쳤으며 法相宗의 철학적 기초를 계 공했다. 한편 陳那의 계통과는 달리 그와 同時代의 唯 識學 者로서 德 慧 Gu 1_1 ama ti가 나와서 世親의 論에 주석 을 썼으며 그의 계 자 安 慧 S t h i rama ti (6 세기)는 『中論』, 『中 邊 辨別論』, Ii'供舍 論 』, 그리고 『唯 識 三十碩』에 주석서를 썼다· 安 慧 는 認 識論 에 있어서 오로지 自證分 하나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依他起性의 法으로 간주했으며 相分과 見分은 過計所執의 妄法으로서 存在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陳那나 護法은 三分 혹은 四分을 모두 依他起性의 法 으로인정한것이다· 그러나두見解모두인식이란心自 體 , 죽아 라야識의 轉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는 唯 識 哲 學 者들로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難陀 Nanda(6 세기)라는 唯 識學 者
는 相分, 見分만을 인정하는 二分說울 주장했다. 2 法稱의 佛敎 論理學 지금까지 우리는 知登 p ra ty ak~a 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陳那의 인식론을 고찰했다· 佛敎論理底은 인식의 다른 하나의 방법인 推 論 anumana 에 관한 이론으로서, 因明 he t uv i dy a 이라 부른다. 因明은 소위 五明이 라 부르는 인도의 전동적 인 다섯 가지 학문의 하나이 다. 五明이 란 聲明 sabdavid y a 죽 文法學 내 지 訓話學, 工巧明 silp a - karma-sth ana-vid y a 죽 기 술, 공예 , 曆敷의 학문, 뿔方 明 ci k it s 죠 -v i d y죠 죽 의 학과 약학, 因 明 hetu -vid y a 죽 논리 학, 그리 고 內明 adhy a tm a- vid y a 죽 자기의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바라문교에서는 베다에 관한 학 문운 말하며 佛敎에서는 물론 佛敎의 학문)을 말한다. 〈因明〉이 란 말의 〈因 he t u 〉이 란 論證의 형식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理由률 가 리키는 말로서, 그것이 논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논리학을 因을 밝히는(明) 학문이라 하여 〈因明〉이라 부르는 것이다. 佛敎論理學의 전동을 살펴볼 것 같으면, 龍樹의 『方便心論』, 『解 . 深密經』의 第八品인 『如來成所作 事 品』, Ii'諭伽師地論』의 〈本地分〉,. 無著의 『大乘阿昆達磨菓論』의 〈論義品〉, 世親의 『如質論』 等에 서 論 證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을 아 어받음과 동시에 論證法의 새로운 경지를 수립한 者는 陳那였다. 그는 『菓輩論』과 『因明正理門論』을 저술했으며 因의 三相說, 九句 因論 빛 三支作法 등의 이론을 통하여 소위 新因明의 전통을 수립 했다갭 陳那 이전에는 推論의 論法으로 五分作法, 죽 다섯 가자 의 命題(宗, 因, 鷹 合, 結)를 사용했으나 陳那는 이 중에 서 〈合〉고1- 〈結〉을 불필요한 것으로 제거하고 三支作法을 세운 것이다. 이것을 新因明이라 부르며 그 이전의 것을 古因明이라 부른다. 陳那 이후 그의 門下에 서 商翔羅主 Sankarasvam i n 는 『因明 入正理論』을 썼 으며 , 또한 7 세기에는 法稱 Dharmak i r ti (650 年頃)이 出現하여 『集量論』의 注釋 書 『証評釋 Prama i;i avar tti ka 』과 『正理商論 N y a y ab i ndu 』이 라는 論
2) 因의 三相說과 九句因論은 후에 說明될 것 임 •
理學 맙 를 처술하여 陳那의 논리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 제 佛敎論理學의 名著로 높이 평 가되 고 있는 法稱의 『正理商論』에 의 거 하여 佛敎論理學의 대 강을 살펴 보기 로 한다. 3)
3) Th. Stc h erbats k y , tra ns., B11ddhis t Log ic ( New York: Dover Publi ca ti on s, Inc., 1962), Vol. II 에 근거합.
法稱은 正理哲學과 마찬가지로 推論울 자기자신을 위한 爲自比量 svar t ha-anumana 과 남을 위 한 爲他比量 p arar t ha-anumana 으로 구별 하고 먼저 爲自比批을 다룬다· 우리가 正理哲學에서 이미 본 대로 推論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추리의 근거가되는 因 hetu , 죽 大名 辭 sadhy a 와 小名辭 p aksa 를 연결 시 켜 주는 中名辭 혹은 表徵 ling a 에 있다. 예를 둘어, 宗-『산에 불이 있다』(불=大名辭; 산=小名辭) 因-『연기가 나는고로』(연기=中名辭) n 兪-『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I, 아궁이에서처럼 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이 되려면 추론의 근거가 되는 因, 즉 〈연기〉를 바로 짚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法稱은 因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條件을 먼저 提示한다. 이것을 因의 三相이라 한다 .4) 첫째 조건은 因(연기)이 結論의 主語, 죽 小名辭(산)에 반 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 것이다(通是宗法性). 거기에〈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거기에 존재해야만 結論이 타당하다는 얘기 다. 둘째 조건은 因은 반드시 結論의 述語, 죽 大名辭(불)와 同類 의 것인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同品定有性). 因이 大名 辭와 함께 언제나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大名辭에 限해서만 存在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因의 세번째 조건은 바로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大名辭와 異類的이 되는 것에는 因온 결코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법칙이다(異品這無性). 둘째와 세째 규칙은 因과 大名辭와의 普通的 周延關係 vy a pti를 알기 위 하여 兩者의 一 致關係를 하나는 肯定的 anva ya 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否定的
4) 因의 三相에 관한 이온은 陳那와 法稱뿐만 아니라 6 세기의 勝論哲學者 프라샤 스라과다에서도 발견된다.
vy a ti reka 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것 同一한 조건을 두 가지로 표현 한 것으로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例外 없이 들어맞으면 된다고 한다. 質用的인 이유로 해서 兩者몰 다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5) 陳那는 『因明正理 F1 論』에서 因의 正과 不正윤 判別하기 위하여 因과 同品 • 異品 과의 관계를 9 가지의 경우로 분류해서 고찰하는 九句因의 理論울 수립했다.
다음으로 法稱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因에 세 가 지 種類가 있다고 한다· 죽 否定과 同一性과 因果性이다. 만약에 推理된 述語(大名辭 불)가 부정적으로 表現되었을 때에는 因도 부 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결론이 긍정적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因은 그 推理된 敍述語와 同一性 아니면 因果性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同一性이란 因 자체로부터 叔述語가 論理的으로 推理되어 나 올 때, 혹은 因이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도 이에 의존하여 결론적인 述語가 따라나울 때 svabhava-anumana 성 립되는 因과 大名辭와의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나무이다, 왜냐하면 은행나무 (혹은 마로니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은행나무〉로부 터 〈나무〉라는 서술어는 논리적 필연성을 갖고 나오는 결론인 것이 다. 西洋哲學에 서 分析判斷 analyt ica l j ud g men t에 해 당하는 개 념 이 댜 因果性이란 因과 大名辭가 因果的 관계를 가질 때 성립하는 것 이다 karya -anumana.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나므로〉라는 식의 추 론이 다. 죽 경 험 에 의 존한 綜合判斷 syn t he ti c j udg men t에 해 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法稱에 의할것 같으면 同一性이나 因果性의 관계가成立하는 것은 因과 大名辭 사이 에 必然的인 本質的 依存關係 svabb 료 va- p ra ti bandha 가 存立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兩者 사이에 必然的이고 보편적인 不離의 관계 av i na-bbava 가 성립하지 않기 때 문이다. 同一性의 경우에는 연역된 사실(大名辭, 〈나무〉)에 그로부 터 연역 하고자 하는 바의 사실 (因, 〈은행 나무〉)이 本性上으로 혹은 論理的으로 依存하여 있으며, 因果性의 경우에는 추리근거로서의 因(〈연기〉)이 추리결론으로서의 大名辭(〈불〉)에 自然的으로 의존하 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因의 세 種類 가운데서 同一性과 因果性을 논한 다음
法처답 은 否 定 의 문제와 관련하여 否定的 判 斷 의 문제를 다룬다. 죽 부정적 판단의 원리와 11 가지 형태들, 그리고 부정적 판단의 성격 과 형 이상학적 意義 동을 논의한다· 부정적 판단이란 法稱에 의하 면 正理나 勝論 과 같은 質 在 論 的 哲 學 과는 달리 단순히 지 각될 수 있는 것의 無知登 anu p alabdh i에 근거하는 것이지 〈不存 abhava 〉이라 는 범주 p adar t ha 가 별개의 인식대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다· 또한 미망사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不存울 인식하는 목별한 인식방법으로서 〈不存 景 〉이라는 것도 設定할 필요가 없다. 지각될 수 있는 것의 無 知覺 이 그 事 物의 不存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된다 는 것 이 다· 그러 나 法稱은 말하기 를 采當한 인식 의 방법 pra maI]. a , 죽 지각이나 추론을 동하여 주어질 수 없는 대상의 存在에 대한 부 정 적 인 관단은 疑心의 原因 sarhsa ya-he tu이 되 는 것으로서 지 식 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전혀 인식의 방법 이 없을 때에는 .:z.. 대상의 不存은 지식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고 한 다. 올바론 인식의 존재는 대상의 존재를 중명하지만 인식의 부족 은 그 대상의 부존을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 금까지 우리 는 爲 自 比 量 svarth a-anumana, 죽 혼자서 스스로를 위하여 추 리하며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法稱의 이론을 고찰했다. 다음으로 그는 他人울 위하여 자기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爲 他比 量 p arar t ha-anum 료 na 의 논증과정 을 다룬다. 爲他比 量 이 란 因 의三相을他人에게전달시키는데있다고法稱은정의한다. 그형식 은 爲 自比 盤 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三段論法 sy ll og ism 과 같다. 죽 n 兪 와 더불어 大前提(〈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 아궁 이에서처럼〉) 를 먼처 세우고 그 다음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서 결 론을 내리는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爲自比 盤 온 歸 納的 성격 을 띠고 爲 他比 量 은 演縮 的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法稱은 爲 他比 量 의 두 형태를 구별하고 있다. 이 둡은 意 味上의 차이는 없 고 形式上의 차이분이라고 한다· 하나는 小名辭(결론의 주어)와 兪 (예)가 因을 共通的인 性質로 지님에 따른 兩者의 一致에 근거한 논중의 형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
,兪―『모든 産物둘은 6) 無常하다』, 병 과 같이 因一『말소리 는 그런 産物 이 다』 結_『말소리 도 無常하다』 다른 하나는 不一致의 형식을 취한다 : 兪――『영원한 것들은 産物이 아니 다.!I, 虛空 7) 처 럼 因―一『말소리 는 産物이 다.!I 結_―『말소리 는 無常하다.!I
6) 〈 産物 kr ta ka 〉이 란 佛敎에 서 有爲法 samskr t a-dharma 에 해 당하는 개 념 이 다. 7) 慮 空 ii. k ii. sa 은 特別히 小乘佛敎와 玲伽行哲뚜에 서 無爲法 asamsk rt a-dharma 으 로 간주된다.
法稱은 다음에 이들 두 형태의 爲他比景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 를 들어 자세히 說明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爲自比量에서 와 같이 否定과 同一性과 因果性에 근거한 추론의 양태들을 논의하 고 있는 것이다· 法稱은 三段論法에서 結論은 반드시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결론은 兪와 因과 同時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法稱은 結論的 命題의 定義, 論理的 誤霞의 三 種 , 죽 成立될 수 없는 asid d ha 因, 不確實한 因, 反因, 그리고 論破에 판 하여 論하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法稱의 『正理商論』에 따라서 佛敎論理學(新因明)의 대 강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Frauwallner, E., ''Dign ag a, Sein _W erk und sein e Entw i ck lung , Wi en er Zeit sc hrif t fu r die Kunde des Morg e nlandes fil (1959) . Hatt or i, M., tra ns., Di gn ii ga , on Percep tion . Harvard Or ien t al Serie s ~ Vol. 47. Cambrid g e , Mass., 1968. Ing a lls, D. H. H. , tran s. , Mate r ia l s fo r the St ud y of Navy a -Ny iiya Log ic. Harvard Orie n ta l Serie s , Vol. 40. Cambrid g e , Mass., 1951 . Mati lal , B. K., Ep iste m olog y, Log ic, and Grammar t'n India n Phil o -soPhic a l Analys is . The Hag ue , Paris, 1971 .
Mookerji, S., The Buddhis t Phil o sop h y of Univ e rsal Flux. Calcutt a, 1935. Randle, H. N., Frag m ents fro m Dinn ii ga . London, 1926. , India n Log ic i n the Early Schools. London, 1930. Tucci , G., tra ns., Ny iiya mukha of Dign ii ga : the Oldest Buddhis t Te xt 011 Log ic, Mate r ia l en zur Kunde des Budclhis m us, Heft 15. Heid e lberg, 1930. , tra ns. , Pre-Di izn ii ga Buddhis t Te 쟈 s on Log ic f ro m Chin e se Sources. Gaekwad's Orie n ta l Serie s , Vol. 49. Baroda, 1929. Vid y a bhusana, S. C., A Hi st o r y of India n Log ic. Calcutt a, 1921. 宇井伯 壽 , 『佛 敎論 理 學 』 , 『陳 那 著 作 0 硏究』 , 『印 度 哲 學 硏究』 第 五
제 15 장 쟈이나哲學體系 굽타王朝 시대에 들어와서 꽃이 피게 된 各哲學學派의 왕성한 철 학적 활동들은 불교철학뿐만 아니라 쟈이나敎에도 큰 영향을 끼치 게 되어 이 시기에 우리는 챠이나철학도 체계적으로 정립되는 것을 본다· 챠이 나 사상가들은 原始쟈이 나敎의 解脫울 중심 으로 한 世界 觀과 倫理룰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他學派의 철학적 이론들을 의식 하여 자신의 認識論과 存在論的 思惟룰 좀더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 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知的 超勢에 응답하여 나온 쟈이나 교의 대 표적 철 학자로서 空衣派의 쿤다쿤다 Kundakunda(4~5 세 기 경 ) 와 白衣派의 우마스바티 Umasva ti (5~6 세기)를 들 수 있다. 前者는 『五原理正要 Pa ii. cas ti ka y asara 』, 『敎義正要 Pravacanasara 』와 같은 敎 義綱要書몰 썼으며, 後者는 『眞理證得經 Ta tt v 료 r t hadh ig ama-su t ra 』이 라는 아주 조직적인 쟈이나敎 綱要 書를 처술했다 .1) 우마스바티 이 후로도 쟈이나哲學은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했지만 큰 哲學的인 變 化는 없었고 다분히 印度哲學史에서 하나의 傍系的인 흐몸으로 존 속해 왔다. 이계 上記綱要 書 둘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챠이나敎의 체계 화된 철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眞理證得經』은 兩派에 의하여 모두 챠이나교의 권위적 綱甄많 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쟈이나 認識論 챠이나철학은 지식을 직접적인 ap a rok~a 것과 간접적인 pa rok~a 것 으로 나눈다. 간접적인 지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지식으 로서 , 意見 ma ti과 聽見 sru ti의 두 종류가 있다. 意見이 란 知覺的 인 知識 p ra ty ak~a 이 나 推論 anumana 울 말한다. 지 각적 지 식 온 타학 파에서는 보통 직접적인 지식으로 분류되지만, 쟈이나에서는 순수 한 감각만으로는 지식이 성립되지 못하고 사유의 행위가 개입하여 야만 되기 때문에 지각적 지식은 간접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聽見 은 권위있는 者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지식을 말한다. 챠이나철학이 인정하는 직접적인 지식이란 일종의 특수한 지각적 지 식 으로서 , 制限知 avadhi- jiian a, 他心知 mana l_ip a ry료y a- jii ana, 完全 知 kevala- jii ana 의 3 종이 있 다· 우선 完全知의 개 념 을 이 해 하려 면 챠이나교의 영혼관을 참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챠이나교에 의하면 영혼 ji va( 혹은 命我)은 마치 태양의 빛과 같이 의식이라는 것을 본 질적으로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한 영혼은 대 상들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는 지식을 소유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영혼은 業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그러한 完全知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業의 産物인 바 우리의 몸과 감각기관과 意根 manas 은 영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完全知를 제약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業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감각기관이 나 마음을 동하여 얻을 수 없는 미세한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사물까지도 볼 수 있는 能力 cla i rvo y ance 을 가지게 된 다고 한다. 이것을 完全知에 대하여 制限知라 부른다. 아직도 時 • 空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他心知는 문자 그대로 他人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으로서, 영혼이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번뇌둘 을 제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時 • 空의 계약 아 래 이루어진다· 制限知나 他心知는 감각기관이나 意根의 매개를 필 요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챠이나 認識論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들의 지식에 대한 相對性
이론이다. 챠이나교는 마하비라 Mahavir a 당시 때부터 實在에 대한 어떤 독단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寬容의 정신을 지녀왔 다. 이 전동이 知 識 에 대한 相 對 性의 이론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 한 인식론적 입장으로 발전된 것이다. 챠이나에 의하면 質在나 혹 은 하나의 事 物조차 무수히 많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 한다· 우리 둘이 보동으로 가지는 지식은 한 사물의 여러 측면들을 다 인식할 수 없고 오로지 관찰자의 觀點에 따라서 한 面만을 보게 된다는 것 이다. 이런 제한된 부분적 지식과 아에 근거한 判斷을 〈나야 nay a > 라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적인 판단은 사물의 한 측면과 보는 立 場 에 따라서만 참이지 絶 對 的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 리의 많은 논의와 논쟁들은 이 접을 看 過하고 部分的인 지식을 無 條件的 진리로 간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쟈이나철학은 주장하기를 불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인 우리의 모든 판단 na ya 들은 〈어떻게 보면〉 혹은 〈아마도 s y ad 〉하는 조건적 표현을 수반해야 한 다고 한다. 챠이 나의 이 러 한 이 론을 條件主 義 s y advada 라 부른다. 챠이나철학은 이러한 條件的 命題들의 일곱 가지 형태를 구별한다 sapt ab hang i-n aya . 죽 우리는 한 事 物에 대하여 말할 때, 다음과 같 은 7 가지 관점을 갖고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S 는 어떻게 보면 P 이 다 sy a d asti . ® S 는 어떻게 보면 P 가 아니다 sy a d nasti (죽 다른 관점으로부 터 볼 것 같으면). ® S 는 어떻게 보면 P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sya d asti ca nasti ca. @ S 는 어 떻게 보면 말할 수 없 다 sya d avakta v ya m. 왜 냐하면 모 순되는 것을 同時에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S 는 어떻게 보면 P 이기도 하고, 말하기 어렵기도 하다 sy ad asti ca avakta vya m ca. ® s 는 어떻게 보면 P 가 아니나, 말하기 어렵기도 하다 sy a d nasti ca avakta vya m ca. ® S 는 어떻게 보면 P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나 말하기 어렵 기 도 하다 sya d asti ca nasti ca avakta v ya m ca.
이 상과 같은 低 理의 相 對 性을 무시 하고 오직 하나의 立 場 만을 絶 對 的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을 쟈이 나哲 學 은 독단주의 ekanta v ada 라 부른다· 그러나 챠이냐의 인식적 상대주의는 회의주의나 不可知 論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제한된 조건하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판단을 확 실하 계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판 단이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그릇된 것일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것 을 의식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2 챠이나 形而上 學 쟈 이나의 인식적 상대주의는 쟈이나의 實 在競에 근거하고 있다· 쟈이 냐에 의 하면 한 사물은 수없이 많은 性 格 들 ananta -dharmakam vas t u 을 지녔다고 한다. 죽 그것이 어떻다는 肯定的인 성격들과 그 것이 어떠하지 않다는 否定的인 성격들을 합쳐서 생각하면 하나의 사물이라 할 지라도 무수한 측면을지녔다는것이다. 따라서 한개 의 사물이라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 다고 한다· 오직 完全知룰 소유한 자 . keva li n 만이 가능한 것이다. 챠이 나에 의 하면 이 러 한 수많은 성 질들 dharma 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 dharm i n 에 속하여 있다. 후자를 곧 實體 drav ya 라 부른다. 실체에 속한 성질 가운데는 없어서는 안될 本質的인 것 ~a 과 偶 然的인 것 p a rya y a 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意識은 영 혼의 본질적인 성질이며 욕망·쾌락·고통등은 변하는 우연적인 성질들인 것이다. 實體 가 변하는 것은 이들 우연적인 성질들 때문 이며, 이 성질들은 실체의 樣態 pa ry a ya , mode 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챠이나철학은 實 在란 변하지 않는 면과 변하는 양면을 다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佛敎는 變 하는 것만 강조하고 베단타 Vedan t a 철학은 不 變 하는 것만 강조하는 一方的 ekanta 見解들 이라고 비판한다· 챠이 나철 학은 실체 를 延長울 지 닌 것 as ti ka y a 과 延長울 가지 지 않 는 것으로 大別한다· 前者는 다시 두 종류로 분류된다. 죽 영혼 혹 은 生命 ji va 과 영 혼이 없는 非生命 a ji va 이 다. 생 명 jiva 혹은 영 혼
은 또다시 해 방된 mukta 영 혼과 속박된 baddha 영 혼으로 구분되 며 속박된 영 혼은 可動的인 것 t rasa 과 固定된 것 s t havara 으로 나뉜 다. 고정된 영혼은 地 • 水 • 火 • 風 • 植物 등의 가장 불완전한 몸에 살 고 있으며 촉각만을 가졌다고 한다. 반면에 可動的인 영혼은 이 보다 더 높은 형태의 몸둘을 가졌으며 감각기관도 두 개 이상 다섯 개까지 가졌다. 意識은 영혼의 본질적 성질로서 모든 영혼은 정도 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같 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業 의 障 U 뷰 에 따라 의식의 정도에 차이 가 생길 뿐이다. 영혼의 고유한 상태는 믿음 darsana, 무한한 앎 jfian a, 무한한 행복 sukha, 무한한 힘 v i r ya 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은 지 식 과 행 위 와 경 험 의 主體이 다 jfiat r , kartr , bhoktr . 속 박된 영 혼은 그것이 태어난 육체에 過在하여 비추고 있으며 그 자체는 형태가 없으나 빛과 같이 그것이 속해 있는 육제의 크기와 같은 형태를 취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연장을 가진 실체의 부류에 속 하는 것이다. 영혼은 영원하나 유한한 것이라고 한다· 비생명체인 실체에는 物質 pu dg a la, 時間 k 葬 la, 空間 akasa, 運動 dharma, 靜止 adharma 가 있 다. 物質的 실 체 는 부분들로 구성 되 어 있어서 나누어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부분을 原子 anu 라 부르며 그들의 결합 samg h ata , skandha 에 의 하여 물체 들이 이 루어 진 다. 쟈이 나哲學에 서 는 우리 의 감각기관과 意根 manas 과 숨까지도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물 질은 원자들과는 달리 觸 • 味 • 香 • 色의 네 성질을 갖고 있으며 聲 은 물질의 본래적 성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空間은 延長을 가진 실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며 연장의 필연적 조건으로서 그 존재 가 추리되어 알 수 있다고 한다. 공간은 연장과 同一한 것이 아니 라 연장의 장소인 것이다· 쟈이나철학은 두 가지 종류의 공간을 말 한다. 영혼과 다른 실제들이 居하는 世間的 空間 lokak 료요과 이것을 넘 어 서 서 있는 超世間的 空間 alokakasa 이 다· 해 방된 영 혼들은 세 간적 공간의 멘 꼭대기에 居한다고 쟈이나敎는 생각한다· 챠이나 철학은 또한 時間을 實體로 인정한다· 시간은 연속 • 변형 • 운동 • 새로움 • 오래됨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 조건으로서, 공간과 같이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그 존재는 추리에 의해 알려진다고 한다. 시 간은 다른 모든 실체들과는 달리 延長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요, 나눌 수 없으며 꼭 같은 시간이 세계의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運動과 停止라는 質體도 역시 추리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진다고 한다. 죽 움직임과 벚음이라는 현상을 가능 하게 하는 필수조건으로서이다. 챠이나철학은 주장하기를 물고기 가 스스로 운동하기는 하나 물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운동이 불가 능한 것처럼 영혼이나 물체들도 움직임의 필수조건으로서 運動이 라는 實體롤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운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웅 직일 수는 없으나 웅적임의 受動的인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停止 도 마찬가지이다. 운동과 정지는 영원하고 형태가 없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온 世間的 空間에 過在해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챠이나 敎의 質體觀 및 形而上學은 勝論哲學과 같은 多元的 實在論의 一種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챠이나敎의 倫理와 解脫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이미 原始챠이나교 믈 다룰 때 언급한 바가 있다. 쟈이나교에서 속박이란 영혼이 업의 물질과 붙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해방이란 우선 업의 물질이 영혼 에 流入되 어 asrava 달라붙지 못하도록 追斷 sarhvara 해 야 하며 이 미 붙어 있는 물질은 消fi€n i r j ara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혼에 물질 을 달라 붙게 만드는 것은 결국 無知에 근거한 激情둘이브로 챠이 나敎의 修行은 實在에 대 한 울바른 이 해 인 正智 sam y a g-jfilin a 를 강 조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쟈이나교의 가르침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므로 正信 sam y a g -darsana 이 선행되어야 한 다. 正信과 正智 후에는 正行 sam ya g -car it a 을 필요로 한다. 우마스 바티 Umasva ti는 그의 『眞理證得經』에 서 이 셋 을 해 탈의 방법 으로 강조한다· 正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五大善 paii ca-mahavra ta이 다· 또한 이미 영혼에 달라 붙어 있는 業을 일찍 소모시키는 방법 으로서 苦行 t a p as 이 特別히 강조된다. 마치 망고열 매 가 더 위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일찍 익듯이, 우리의 業도 苦行 t ap as( 〈열〉이라는 뜻)을 통하여 더 빨리 消能되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解放된 영혼들은 自己의 本性을 되찾아 神들의 세계보다도 더 높
이 있는 宇宙의 꼭대기에 上昇하여 거기서 解脫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찹고문헌 Faddego n, B., tra ns., Pravacanasara. Cambrid g e , 1935. Glasenapp , H. v., Der Ja in i s m us. Berlin , 1925. Jai n i, J. L., tran s., Umaswami 's Tatt va rth adhig a ma-sutr a . Arrah, 1928. , Outl ine s of Ja in is m . Cambrid g e , 1916. Jac obi, H., tra ns., Ein e Jai n a Dog m ati k (Umasvati 's Tatt va rth a- adhig am a-sz'i tra) , Zeit sc hrif t der Deuts c hen Morge n landis c hen Gesellschaft . Vol. 60 (1906) . Kohl, J. F., Das phy si k a li sch e und biol og isch e We lt bil d der Ja in a. Al iga nj, 1956. Mehta , M. L., Outl ine s of Ja i1 1 a Phil o sop hy . Bang a lore, 1954. Mookerji, S. , The Ja in a Phil o sop hy ·of Non-absolut ism : A Crit ical St ud y of Anekanta v ada. Calcutt a, 1944.
제 16 장 미망사學派의 哲學 1 미망사哲學의 傳統 인도철 학에 서 六派哲學은 불교나 챠이 나교와는 달리 베 다 Veda 의 권위를 인정하는 正統학파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미망 사 M i ma ip sa 와 베 단타 Ved 료 n t a 학파는 가장 정 동적 인 학과라고 할 수 있다. 他 학파들의 베다와의 관계는 사실상에 . 있어서는 名目的인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미맘사와 베단타는 본래부 터 곧바로 베다의 충실한 연구와 해석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발 전된 철학들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베다는 그 내용상 諸神들에 게 바치 는 碩歌들을 모아 놓은 本集 Sa th h it a 의 부분과 이 것 을 설 명 하고 제 식 의 규정 들을 취 급하는 브라흐마나 Brahma Q a 로 구 분된다· 그러나 브라흐마나의 나중 부분에는 祭祠의 관십을 벗어 나 宇宙와 人間에 대한 철학적 지식의 문계를 다루는 우파니샤드 U p an i ~ad 가 포함되 어 있 다. 이 부분을 知識篇 J臨 na_kanda 이 라 부 르며 제사의 행위믈 주로 하는 부분인 行爲篇 Karma-~ ga과 구별 되어 왔다. 미망사와 베단타는 각기 이 두 부분을 탐구하고 고찰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서, 미망사學派는 먼저 부분, 죽 행위 편을 고찰한다 하여 푸르바미맘사 P ii rva-m i ma th sa 라 부르며, 베단타 學派는 나중 부분을 연구한다 하여 웃타라미 망사 U tt ara-m i ma xµ sa 라 불러왔다. 혹은 그 연구 대상이 각각 행위와 브라흐만에 대한 지
식 이 기 때문에 카르마미 망사 Karma-m i ma rp sa 와 브라흐마미 망사 Brahma-m i mamsa 라 부르기 도 한다. 1) 〈미 망사 m i m 죠 msa 〉 란 말은 〈尋 究〉라는 뜻을 지녔다. 동상적으로 미망사라 하면 푸르바미망사 P il rva-m i mamsa 를 지 칭 하며 웃타라미 망사는 베 단타라 부른다.
1) 혹은 〈 Dharma-m i mamsa 〉와 〈Jii ana-m i mamsa 〉라고도 불린 다.
祭式에 관한 전통은 원래 本菓 Samh it a 이 나 브라흐마나 Brahmal) a 몰 통해서 완전하고 분명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口傳에 의하여 보충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구전이 점점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베다의 行爲篇으로부터 직접 추리와 는층을 동하여 제식의 올바른 규범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 推 理의 활동을 냐야 n y a y a 라 불렀으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祭式의 문제와는 별도로, 올바른 사고의 규범을 다루는 독립적인 형식논 리 학파로 발전하게 된 것 이 다. 한편 제 식 의 規範과 命令 v i dh i들을 제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돈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이것이 미암사學 派륭 형성하게 된 것이다. 미망사學派의 창시자는 기원전 2 세기 경의 인물로 추정되는 자이미니 J a i m i n i로 전해지고 있으며, 근본 경 전은 『미 망사經 M i ma rp sa-s ilt ra 』으로서 서 력 기 원 1 세 기 전후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맘사經』은 다 른 학파의 經들과 마찬가지로 간결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 그자체~ 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現存하는 주석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5 세기 경에 샤바라스바아민 Sabarasv 료 m i n 에 의하여 씌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브르티카라 Vr tti kara 라는 사람의 『미망사經』에 대 한 해석의 일부분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며, 거기서 브르티카라 는 불교의 철학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아마_s:_ 미망사철학에 상당한 깊이를 제공한 자로 간주된다. 샤바라스바민 이후 프라브하카라 미슈라 Prabhakara M i sra(7 세기)와 쿠마릴라 브 핫따 Kumarila Bhatt a (8 세 기 ) 라는 미 암사철 학의 거 장들이 출현 하여 샤바라스바아민의 저서에 주석을 가하고 미망사철학의 兩大 학과인 구루 Guru 派와 브핫따 Bha tt a 派몰 각각 형 성 하게 되 었 다· 미 망사~ 派에다 哲學的인 이론을 부여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 둘의 공헌 으로 간주되며 그들 이후에는 미망사哲學은 별로 이론적인 發展을-
보지 못했 다· 프라브히 카라의 주석 은 Brha ti라 불리 며 이 주석 에 그의 제 자 샬리 카나타 미 슈라 Sali ka nath a M i sra 는 ~j uv i mala 라는 復 社 풀 썼다· 그는 또한 프라브하카라의 미맘사解釋에 대한 綱要 書 인 Prakara 7J ap anc i ka 도 썼다. 한편 쿠마릴라는 샤바라스바민의 주석 에 三部의 해 설 서 롤 처 술됐 다. 죽 Slokavartt ika , Tantr a var- ttika , 그리고 Tu ptz ka 의 三部이다· 쿠마릴라의 門下에 만다나미 슈 라 Ma i:iq anam i sra 가 나와서 Vi dh iv i v e ka, Mzmarhsanukrama 끄i, Tan t ravar tti ka 를 처술했다· 그러 나 그는 나중에 샹카라 Sankara 의 영향으로 베단타哲學으로 轉向했다. 그 외에도 쿠마릴라의 브핫따 派에 많은 학자들이 출현하여 프라브하카라의 구루派를 압도하게 되었다. 쿠마릴라는 본래 佛敎풀 공부했으나 나중에 바라문敎로 轉 向했다고 하며, 그의 著 書 를 통하여 佛敎의 空思想을 신랄하게 공 격하고 있다. 쿠마릴라는 샹카라와 더불어 印度에서의 佛敎思想의 쇠퇴에 큰 역할을 한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계 쿠마릴라와 프 라브하카라를 중심으로 하여 미망사哲學의 대강을 살펴보며, 필요 에 따라서 兩論師의 차이점도 언급하도록 한다. 2 미망사 認識論 『미망사經』은 베다가 命하는 祭式의 행위를 올바로 행하도록 하 는 解釋의 원리들을 규정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 망사哲學은 〈미 망사 mi m amsa>, 죽 尋究의 方法에 대 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미망사哲學에서 規定한 論究의 이론 은 他學派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미맘사에 의하면 어떤 本 文 t ex t의 意味룰 확정지으려면 다음 5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主張의 對象 v i혼 a y a 의 확정 ® 이 에 대 한 疑問 samsa y a 의 討論 ® 反論 pti rva p ak 훈 a, 죽 他主張의 겁 토 ® 定說 utt ar apa k ~a, sid d hanta , 죽 最終結論 ® 結論이 本文의 다른 부분에 대 하여 갖는 관계 samg ati 이러한 論理展開의 문계 外에, 미망사학파의 근본 철학적 관심사
는 어디까지나 베다가 명하는 행위의 의무 dharma 를 이론적으로 뒷 받침해 주는 데 있다. 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하여 그 수행이 선한 業報 를 가져오게 되는가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 이다· 우리는 브라흐마나에서 이미 제사의 주관심이 제사의 대상 인 神에서부터 제사의 行爲 자체로 옮겨졌음을 보았거니와 이러한 경향은 그후 더욱더 발전하여 신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제사행 위는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미맘사哲 學 은 행위의 결과를 보증하는 어떤 最高 神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그 존재조차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 러므로 오직 베다 자체의 권위에만 의거하여 제사행위의 의무와 그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베다의 권위는 어떻게 성 립이 되는 것이며 베다에서 命하 는 의무와 그 의무를 행하면 天上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떻 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망사의 認識이론에 接하게 된다· 미망사는 올바른 지식의 수단으로서 現 量 pra ty ak ~a, 比 盆 anumana~ 먄曜 量 up a mana, 義 準 景 arth ap a tt i, 不存 景 abhava 등을 인정 한다. 現 量 , 죽 지각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접촉에 의하여 직접 적인 지식을 얻는 인식방법으로서, 두 단계로 성립된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 감각기관이 물체와 접할 때 自我 a t man 에 無分別的 nir v ik a lpa 知覺이 일 어 난다고 한다. 죽· 사물의 성 격 에 대 한 어 떠 한 의식이나 판단없이 대상의 존재만이 주어지는 인식단계이다. 1 다음에 야 비 로소 分別的 savik a lpa 知覺이 이 루어 진 다고 한다. 즉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각을 말한다. 그러나 미망사철 학은 말하기를 두번째 , 단계에서 분명히 알려지게 되는 것은 이마 첫번째 단계에서도 암시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 이 단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대상을 分別하는 것뿐이지 어떤 새로운 내용이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陳那 의 인식론에서 말하고 있는 分別作用 v i kal pa 의 査曲的 役割울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성격이 전혀 없는 사물의 순간적
特殊相 svalak~a i:i a 만 인식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베단타 철학에서처럼 아무런 목수한 속성도 없는 순수존재만 의식하는 것 도 아니라고 하여 미망사哲 學 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뺨兪量 이란 현재에 경험한 것과 과거에 경험한 것을 기억에 의하 여 비교하여 兩者의 類似性을 아는 지식이다. 比 뮬 (推 論 )에 대한 이해는 正理哲學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인식방법은 모두 경험에 의거한 것으로서 미맘사 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業報 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미 망사철 학은 聲量 sabda 울 중요한 인식 방법 의 하나로 의 거 하고 있 다. 聲景에 는 人格的인 것 p auru~e y a 과 非人格的인 것 a p auru~e y a 의 두 가지가 있다. 구루 Guru 派는 後者만 인정하고 브핫 따 Bha tt a 派는 兩者를 모두 인정 한다. 베 다는 미 망사철학에 의 하 면 비인격적인 성량이다. 베다는 神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고 믿 을 만한 사람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미망사철학은 베다의 權威를 인정하는가? 미망사철학은 베다 그 자체가 영원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중명하기 위하여 言語에 관하여 많은 독특한 이론들을 전개하게 되었다. 미망사哲 學 에 의하면 말이란 단순히 發音과 함께 비로소 생기는 소리로서의 현상이 아니다. 말의 본질은 소리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글자들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글자로서의 말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發音되지만 그 自 體 는 언제나 同一하며 時空~ 超越한 永續的인 존재라는 것이다. 말이란 소리로 표현이 안될 때 에도 항시 可能的으로 潛在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人間이나 神에 의하여 만들어전 것이 아닌 永遠한 存在인 것이다. 미망사는 이와 같은 言語 一般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결국 베다의 영원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망사에 의하면 言語의 意 味도 인간의 계약이나 관 습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神의 뜻에 근거한 것 도 아니 고, 오로지 自 然的인 anutp a tt ika 것 이 라 한다· 言語와 對象 과의 관계는 本來的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망사에 의 하면 세계나 인간에는 시초가 없었으며, 따라서 어느 한때에 인간의
관습에 의하여 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들 은 처음부터 사물 들에 대하여 이미 말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이란 永 遠 히 존재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 여러 조건하에 表現될 따름이다. 말이 個物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類 j a ti를 나타내는가에 대하여서 도 미망사철학은 말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는 個物둘을 뜻하기보 다는 변하지 않는 類룰 뜻한다고 주장한다. 말이 보편성을 지녀야 베다의 여러 命令들이 보편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미망사 學 派에 의할것 같으면, 말의 本 質 的인 性格은 사물의 표현 에 있을 분만 아니 라 行動을 命令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미망사哲學의 祭式行爲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이론이 다. 우파니샤드를 除外하고는 베다 全 體 가 미망사에 의하면 우리의 宗敎的 義務에 관한 것으로서, 베다의 모든 文 章 은 이러한 義務 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 認識의 다섯 번 째 手段으로서 미 망사哲 學 은 義準量 ar t hap a tti이 라 는 것을 든다. 의준량이란 설명을 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필연적인 唯一한 假說로서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설은 진리로 받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망사철학은 의준량에 의하여 無前力 a pii rva 이 라는 것 의 존재를 안다고 한다. 미 망사철 학은 제 물을 받고 복을 주는 것은 神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행위 그 자제이다, 이 행위는 전에 없던 어떤 보이지 않는 힘 sakti , 죽 無前力 a pii rva 이 라 는 것을 自我에 산출하며, 이 힘은 필연적으로 그 업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쳐온다고 한다. 베다에 의하면 祭祀의 行爲는 어떤 結果 룹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사의 행위 자체는 참깐동안에 끝나 버리 는 고로 無前力의 假說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위가 결과를 가져 온다는 베다의 眞理는 설명이 안되고 거짓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서 無前力이란 것은 현재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하 여 장차 내세에 天上에서 얻게 될 業 報와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 하여, 행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自我에 생기게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가정되게 된 것이다. 마지 막으로 미 망사철 학의 브핫따 Bha tt a 派는 不存 量 anu p alabdh i이
라는 것을 독립적인 인식의 방법으로 인정한다. 죽 무엇이 존재 얀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直 接的인 인식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知 覺 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存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시 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렇 다고 推 論 에 의하여 不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이미 不知 覺 과 不 存과의 사이에 周延관계 v y a pti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先 決 問 題未 解 決 의 오류 륭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不存은 지 각이나 추론에 의하여 認識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뿐兪量 이나 聲量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不存이란 비교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말에 근거해서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不 知 礎 anup a labdhi 자체를 不存을 아는 독립된 인식의 방법으로서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不存 甄 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不知 登 이라고 해서 무조건 不存울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각되지 않는 경우에만 不存 量 은 成 立되는 것이라고 한다. 미망사는 지식의 타당성에 대하여 正理哲 學 과는 아주 다른 견해 를 갖고 있다. 미망사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지식은 그 自 體 에 스 스로의 采 當 性을 지니고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다른 어떤 외 적인 중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그 것에 대한 믿음을 자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물론 나중에 의심을 하 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추론에 의하여 그 지 식이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타당성은 일단은 自明하여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선 그것을 믿고 행 동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원리를 聲量 sabda 의 경우에 적용할 것 같 으면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한 베다의 말을 일단 믿고 행동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다의 권위는 自明하다 . 따라서 미맘사學 派는 베다를 의심할 만한 理由들을 논박하기만 하면 되지 베다의 眞理룰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망사의 학설 을 認識의 本有的 采當性의 理論 sva tal_i-p rama l).y a-vada 이 라 부 른다. 이에 따라서 미맘사학과는 誤騰에 관한 이론들도 展開했으
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인식의 本有的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프라브하카라는 陳那의 認識論과 비 슷하게 인식 의 三面을 말하고 있 다. 죽 知識 i n 료 na 은 언 계 나 스스로를 드러 내 는 빛 sva y arh p rakasa 을 갖고 있으며 이 와 同時 에 그것의 主體 i na t r 와 客體 jfi e y a 를 드러낸다고 한다. 따라서 프. 라브하카라에 의 하면 모든 지 식 은 自 我의 인식 aharhvit ti, 對象의 인 식 vi~ a y av it ti, 그티고 인식의 인식 svasarhv itti라는 세 가지 인석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自我 a t rnan 는 모든 인식에 있어서 앎의 主體 로서 알려질 뿐이지 결코 앎의 對象으로는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自我는 지식과 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自明性을 지닌 存在 가 아니라고 한다. 버 1 단타哲賤의 自我觀과 다른 점의 하나다. 한편 쿠마릴라는 知識의 本有的 采當性을 인정하면서도 프라브하 카라와는 달리 지식은 스스로의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 에 의하면 지식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다· 마치 손가락의 끝이 스스로를 건드릴 수 없는것과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식이란 自我 atm an (영 혼) 의 變形 p ar i n 료 ma 상태 로서 自 我가 대 상을 아는 행 위 kr iy a 나 작용 vy a p ara 이다. 知識온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으며 오로 지 그 대 상이 自 我에 의 하여 알려 졌 다는 사실 jfi a t a t a 로부터 간접 적 으로 추리되어서 알려질 뿐이다. 어떤 대상이 친숙하게 혹은 이미 아는 것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이로부터 미루어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안다는 것이다. 3 미망사 形而上學 미망사의 世界競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영원하고 무한한 영혼들 이 個人의 수만큼 많이 存在한다· 그리고 物質的인 世界를 구성하 고 있는 要素둘이 형성되는 데에는 業 의 法則이 作用하고 있다· 따 라서 世界는, 영혼이 과거의 業 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되는 生命體 들 bho g a y a t ana 과 業報믈 感受하는 도구인 감각기 관들 bhog a -sadhana 과 감수되 어 야 할 業報 로서 의 대 상들 bho gy a-v i !)a y a 로 구성 되 어 있 는것이다.
미망사의 형이상학은 대체로 質在論的인 勝論哲學의 강한 영향을 받아 많은 공동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差異는 勝論철학에서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原子의 결합과 재결합과 과 괴, 그리고 원자와 영혼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創造神 Isvara 의 존 재를 인정하지만 미망사는 그런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힌두교 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인 세계의 週期的인 창조와 과 괴의 반복과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가 항시 변하고 있다는 사 실온 인정하지만 영혼들의 주기적인 展開와 退轉은 부인한다· 모든 생물들은 자연적으로 生成하며 神은 사람들의 功過플 알 수도 없으 며 감독할 수도 없다고 한다 · 또한 원자들이 神의 意志에 따라서 행동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감독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영혼 과 육제와의 관계에서뿐이며, 영혼은 오직 자기의 業의 功過에 따 라 육체를 차지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 쿠마릴라는 당시의 여러 가지 創造說둘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 다· 그는 물질의 창조 이전에 프라자파티 Pra j a p a ti와 같은 神이 존 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 神이 몸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창조의 욕망을 낼 수도 없으며, 몸이 있었다면 그의 창조적 행위 이전에 이마 물질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의 動機도 알 수 없다. 神은 어떤 道德的인 目的을 위하여 世界를 창조했을 수는 없 댜 왜냐하면 도덕적 공과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또한 세계의 많은 고통과 죄악을 보아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 신이 단순히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는 完全한 幸福을 누린다는 것과 모순 되며 쓸데없이 그가 바쁜 일에 애쓰기만 하는 셈이 된다. 쿠마릴라 는 不二論的 베단타哲學의 입장도 반박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絶對 者가 절대적으로 純粹하다면 세계도 순수해야 할 것이며 그런 상태 에서는 無知 avid y a.£. 있을 수 없는 고로 창조도 있을 수 없다. 만 약 다른 어떤 것이 無知룰 일으킨다면 브라흐만 Brahman 만이 唯一한 존재라는 진리는 무너진다. 한편 만약 無知가 自然的인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쿠마릴라는 상 키 야 Sarhkh y a 철 학의 世界轉變說도 비 판한다· 그는 말하기 를 세 계 의
창조가 세계의 구성요소 g una 의 평형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최초에는 果報룰 초래하는 인간의 業이란 것이 없었는데 어 떻게 그 평형이 깨어지기 시작했는가라고 反問한다. 미망사철학은 最高神울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無神論을 주장하지 만 業報를 누리게 되는 自我(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마망사철학은 自我의 質體性을 부정하는 佛敎의 견해를 신랄하게 공격한다. 불교에 의하면 自我란 순간순간의 관념들의 연 속적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먼저의 관념은 후의 관념에 영향을 준 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것과 나중 것의 根底에 어떤 공동의 質粒 subs t ra t um 가 없는 한 관념과 관념 사이의 어떤 連結이 나 상호작용 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 라 行爲륭 한 사람이 자기 가 행 한 행동의 結果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위의 합리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한다· 또한 관념들이 어떻게 하여 한 육체에서 다 른 육체로 옮겨질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기 때문예 輪廻라는 것도 설명되기 어렵다고 한다· 쿠마릴라는 영혼의 存在를 증명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육체의 요소들은 知性이 없기 때문에 그 들의 결합은 결코 지성을 산출하지 못한다. 육체가 하나의 유기체 적인 全體라는 것도 그것이 그것을 다스리는 어떠한 他存在의 目的 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한다· 우리가 〈나의 몹〉이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울 말한다. 또한 記憶 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도 어떤 精神的인 實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미망사哲學에 의할 것 같으면 知識은 本有的 采當性을 갖고 있다· 그리고 프라브하카라는 知識은 스스로를 드러 내는 自明性까지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맘사學派에 의하면 自我 자체는 그러한 빛이냐 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自我의 存在는 自明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正理哲學에서처럼 직접적인 지 각의 대 상이 될 수도 없 다고 한다· 프라브하카라 Prabhakara 에 의 하면 自我는 우리의 모든 인식활동에 필연적으로 관여되며 이러한 인식활동들을 동하여서만 드러난다고 한다. 즉 대상을 아는 인식활 동에 있어서 自我는 그 지식의 主體로서 항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식이 〈나의 인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쿠마릴 라는 自我意識이 대상의 의식을 항시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다. 단지 우리가 가끔 自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기는 自我意識 self -c onsci ou sness, aharhvit ti 가운데 의 對象으로서 만 우리 는 自 我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루 Guru 파는 이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自我意識이라는 것 자제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自我가 의식의 主體와 客體가 동시에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主體 와 客體의 기능은 兩立할 수 없기 karma-kartr - vir o dha 때문이다. 4 解脫論 미망사學派는 본래 재사의 행위와 이에 따른 業報를 궁극적인 關 心 事 로 한 哲學이다. 따라서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도 본래는 올바 른 祭式의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天上의 福樂을 理想으로 하는 樂觀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他學派의 영향을 받아 自我의 解脫, 죽 육제와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最高의 삶의 理想 n i]:i sre y asa 으로 인정 하게 되 었다. 해 탈이 란 自 我가 좋고 나쁜 行爲와 육체를 떠나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한 自我의 상태에는 아무런 인식이나 경험도 있을 수 없다. 희열 도 느끼 지 않는다· 고통과 즐거 움을 떠 나서 自 我가 본래 적 인 svasth a 상태에 들어갈 분이다. 自我는 識 c it이나 喜脫 ananda 을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망사學派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自我를 아는 知識과 義 務的인 行爲를 利害心 없이 순수하게 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바가 바드 기타.!I에서 말하는 〈카르마요가 karma- y o g a 〉의 실천을 重視하 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맘사哲學은 베다의 命令 빛 재식행위에 대한 義務와 解脫에 대한 要求를 同時에 充足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현 Edg e rto n , F., tra ns., The M im i im sii Ny iiya Prakasa of Ap ad e vi : a Treati se 011 the M im i im sii Sy s te m by Ap ad eva. New Haven, 1929. ]ha , G., Prabhii ka ra Sclzool of Pii .rv a M im i im sii. Benares, 1918. , Pii .rv a M im i im sii in its S ources: wi th a crt't fral bt'b l i og r aph y by Umcsha Mi sh ra. Benares, 1942. , tra ns. , The Pii .rv a M im i im sii Sii .tra s of ]aim t 'ni. Allahabad, 1916. , tr ans. , Sabarabhii ~ya . Baroda, 1933. , tra ns. , Sloka-vii rt t ika . Allahabad. Keit h, A. B., The Karma M im i im sii. London, 1921 . Sandal, M. L., tra ns., Tlze M im i im sii Sii .tra s of Jai m i lli. Allahabad, 1923-1925. Shastr i , P., I11t ro ducti on to the Purva-Mi m i im sii. Calcutt a, 1923. Thadani, N. V., The M im i im sii: the Sect of the Sacred Doctr i n es of the Hi nd us. Delhi, 1952. Str a uB, 0., Die alt es te Phil o sop hie der_ Karma Mi m amsa, Sit zu ng s -bert'c h te der PreuBis c he11 Akademi e der Wi ss e11schaft (19 32) .
제 17 장 不二論的 베단타哲學 1 샹카라 이전의 베단타哲學 베 단타 Ved 료 n t a 라는 말은 본래 베 다 Veda 의 끝 anta 혹은 目 的 이 라는 뜻으로 우파니 샤드 U p a ni ~ad 몰 가리 키 는 말이 다. 1) 그러 나 동시에 베단타는 우주의 궁극적이고통일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우파 니샤드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킨 哲學體系물 지칭한 댜 베단타哲 學 은 印度의 여러 철학제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추 종자들을 가져 왔고 가장 영 향력 있는 철학으로서 , 과거 약 1000 년 을 동하여 다른 모든 학파들을 지적 활동에 있어서 압도하게 된 哲 學 이다. 베단타철학은 그 根本經典으로서 우파니샤드 자제는 물론 이고, 우파니샤드 哲學의 延長이나 다름없이 간주되는 『바가바드 기타』와 또한 우파니샤드의 다양한 철학을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闇 明하고자 하는 『베 단타經 Ved ii n ta -s iit ra 』 혹은 『브라흐마經 Brahma- s iit ra 』에 기초하고 있다· 『브라흐마經』은 서력기원전 1 세기경의 인 물로 추정되는 바다라야나 B ii dar iiy a 1_1 a 가 著者로 전해져 왔으나 그 內容上으로 보아 4~5 세기 경에 이르러 현재의 형태로 完成된 것으 로 보여진다 .2)
l) ,여단타〉라는 말은 이미 後期 우파니샤드인 M11~< fa ka Up an i~ a d 3, 2, 6 이나 Sveti isv ata ra Up aa 11i $d 6, 22, 그리 고 Bhag a vad Gi tii 15, 15 에 쓰이 고 있 다. 2) II'브라흐마經』에는 後期大 乘 佛敎의 思想이 나 無 神 論 的 상키 야哲 學 이 비 판되 고 있다.
『브라흐마經』에 의 하면 오로지 上層階級의 사람만이 절 대 자인 브 라흐만 Brahman 을 알 자격이 있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베다 聖典에 근거하며, 인간의 독립적인 사고나 이론도 베다성전과 더 불어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브라흐만은 最高者 , 人格的 存在, 純粹한 精神的 質體, 純粹한 有로서 常住進在, 無限不滅 의 존재 이 댜 萬 有의 生起와 存 紹 과 歸滅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萬有 의 母胎 이다· 브라흐만은 世界의 質料 因이기도 하며 世界의 創造主 이기도 하다· 브라흐만은 轉礎 에 의하여 세계를 산출하며, 이렇게 전개돼 나온 현상세계는 세계의 원인으로서의 브라흐만과 다르지 않다. 세 계가브라흐만으로부터 전개돼 나올때는空.風·火·水·地의 순 서로 전개되어 나오며, 이 다섯 개의 원소가 다시 브라흐만으로 돌 아갈 때는, 전개과정의 逆順序를 따라 還滅한다고 한다. 세계의 창 조와 존속과 귀멸의 과정은 무한히 반복된다. 個人我 ji va 는 브라흐 만의 部分이며, 그것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無始 이래로 流轉을 계속하고 있다· 業 의 應報는 無前力 a pii rva 에 의 한 것 이 아 니고 神의 裁定에 의하여 받는 것이다. 인생의 궁극 목적은 브라흐 만과의 合一을 동한 解脫에 있다. 해탈을 얻는 방법으로서 브라흐 만의 膜想에 의 한 知 v i d ya를 강조하고 있으며 , 브라흐만에 대 한 知 를 얻은 자는 死後에 神들의 길을 따라서 최후에 브라흐만에 이르 러 브라흐만과 합일한다. 이렇게 해탈을 얻은 자는 세계의 창조와 유지의 힘을 제외하고는 철대자와 꼭 같은 완성과 힘을 갖춘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우파니샤드 철학이 후기에 가서 다분히 상키야 Sam_ kh y a 적 으로 발전되 었음을 보았거 니 와 상키 야철학이 본격 적 으로 二 元論的인 世界觀을 전개 함에 따라, 우파니 샤드의 연구가들 가운 데서는 이에 반발하여 우파니샤드의 本來的인 一元論的 사상을 옹 호하려는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흐마經』은 이러 한 사상적 운동의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상 『브라흐마經』 에는 상키야철학의 無神論的 二元論을 곳곳에서 批判하고 있는 것 이다. 『브라흐마經』은 내용이 지극히 함축적이고 간략해서 그 자체로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세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 경에 証 釋書 를 썼으며, 이들 주석가들은 각기 서 로 다른 哲學的 解 釋 과 見解둘을 보이 므로 자연히 베 단타哲學 자 체내에서도 이 주석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學派들이 成立되게 되 었다· 모든 베단타哲學者들은 世界룰 여러 개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實 體 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多元論的인 견해를 배척하고 多 樣 한 現 象 世界의 배후에 단 하나의 窮極的이고 統一的인 實在가 있 다는 一元 論 的인 世界f룹을 따른다· 문제는 어떻게 이 궁극적인 實 在와 현상세계, 죽 物質 및 個人의 영혼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에 따라서 버 1 단타哲學者들은 상호간에 차이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궁극적인 質在(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와 함께 相異한 實 體 둘의 존재도 인정하며 世界를 이 實 體들의 相互作用으로 說明하되 브라 흐만은 그들을 초월하고 그들을 支配하고 調整하는 어떤 존재로 간 주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世界의 모든 存在둘 은 唯一한 存在인 브라흐만이 多樣性의 세계로 자기풀 展開한 結果 로 나타나는 顯現樣態로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立 場 에서는 多樣性의 세계는 唯一無二한 實 在인 브라흐만을 가리우고 있는 베일과 같은, 그러나 알고 보면 단지 假 象 에 지나 지 않는 것으로 抱撰하는 思想도 있는 것이다· 現存하는 『브라흐마經』의 주석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 장 유명한 것은 약 800 년경에 씌어진 샹카라 Sankara 의 『브라흐마 經疏 Brahmas ilt ra-bha~ y a 』로서 , 위 에 서 언급한 세 가지 見解 가운데 서 세번째 立場울 옹호하는 해석서이다· 그러나 샹카라의 주석서를 동하여 우리는 그 전에도 『브라흐마經』에 대한 많은 해석과 주해 가 가하여져 왔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샹카라의 철처한 不二論的 adva it a 인 철학적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해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브라흐마經』 自 體 의 철학적 입장은 샹카라의 不二論的哲學과는 상당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의 不二論的인 해석은 무엇보다도 그의 스승 고빈다파다 Govin d ap a da 를 동하여 , 혹은 직 접 으로, 가우다파다 Gau9a 函 da 라는 哲學者의 사
상적 영향웅 맡은 것 으 로 여겨지고 있다• 가우다파 다는 『만두키야 카리 카 Ma i:i 4uk y a-kar i ka 』 라는 『만두 키 야 우파니 샤드 Mai:i 4u ky a Up a - n i !}ad 』 의 철 학을 다루는 論맙 의 저 자로서 , 그곳에 서 그는 우리 가 아 는 한 처 움으로 철처한 不二論的 버 1 단타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다. 샹카라는 이 『만두키야 카리카』에 대한 주석서를 썼으며 거기 서 샹카라는 베 다의 不二論的인 철 학 이 가우다파다에 의 하여 비 로 소 되찾아졌다고 하여 가우다파다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나타내 고 있다. 가우다파다는 大 乘佛敎 의 空 觀思想 이나 唯識思想 의 강한 영향을 받은 자르서, 그의 처서에서 우리는 이들 불교철학에서 사용하는 술어들이나 비유 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佛敎의 論師 박카 Bakka 라는 사람의 제 자였 다고 한다· 그는 우파니 샤드 의 철학이 불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 는 일체의 生滅하는 현상세계 p ra p a fi ca 는 實在 인 神의 불가사의한 힘의 幻 術 m a.y a 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며 實在 의 세계는 어떤 多樣 性이 나 二元性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 眞諦 의 궁극적 인 입 장에 서 볼 것 같으면 꿈의 세계와 깨어 있는 세계는 마찬가지이며 외부 의 세계나 마음속에 나타나는 세계나 모두 우리의 妄想의 所産으로 서 거짓이라고 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實在 의 世界에는 主客의 區別이나 相異 한 主體들과 客體들도 사라지며, 生滅 도 因果도 없으며, 속박된 존 재도 없으며 해탈을 원하는 자도 없다. 오직 빛나는 하나의 아트만 A t man 만이 존재 할 뿐이 다. 가우다과다는 아트만을 무한한 공간에 비유한다. 個人我 ji va 는 병 속의 공간과 같이 制限된 것같이 보이 나 결국 하나의 아트만만이 存在하는 것이다. 賢明한 者는 요가의 修行웅 통하여 이 와 같은 認識 에 도달한다는 것 이 다 . 가우다파다는 이렇게 萬物을 브라흐만의 假現 v i var t a 으로 보는 베단타哲 學 웅 전개한 것이다. 〈마야 ma y a 〉의 개념은 이미 『슈베타 슈바타라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 기타』에 나타나 있지만, 거기서 는 마야란 어디까지나 神이 스스로를 다양성의 세계로 전개하는 創 造的 힘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마야는 認識 主競의 無知,
혹은 우리를 속이는 神의 幻 術 로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가우 다파다에 와서 決定的으로 假現說 viv a rta v ada 혹은 마야說 may a vada 로 成立되 게 된 것 이 다. 샹카라의 不二論的 advait a 베 단타 해 석 은 바로 이 立 場 을 代表하는 것이다• 2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 단타哲學 가우다파다 Gau q a p ada 의 철 저 한 一元論的인 實在觀을 이 어 받아 不二 論 的 버 1 단타 Advait a Vedan t a 철 학을 大成시 킨 사람은 샹카라 San- kara 였 다· 그는 『브르하드 아라니 야카 우파니 샤드 BrhadaraI_ lya ka U p an i ~ad 』를 비 롯한 주요 우파니 샤드들에 주석 을 가했으며 또한 『바가바드 기타 Bhaga vad G it a 』에도 주석서를 썼다. 그러나 그의 철 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처서는 『브라흐마經』에 대한 주석서 『브라흐 마 經 疏 Brahmaau t ra-bha~ y a 』로서 여 기 서 그는 여 러 가지 他學說둘을 비판해 가면서 不二論的인 베단타철학의 입장을 확고히 다진 것이 다· 그는 南인도 출생으로서 인도 각지방으로 遊行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학설울 전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철학에 입각 한 종교적 실천을 위하여 佛敎의 寺院들처럼 많은 출가자들의 단체 를 만들어 苦行의 실천과 더불어 브라흐만의 知識울 추구하였다. 샹카라는 佛敎의 思想的 영향하에 페다의 思想을 再解釋함으로써 바라문교의 부흥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이미 쇠되해 가고 있던 佛敎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 것이다. 샹카라에 의하면 참으로 存在하는 것은 모든 形相 책iir a 과 性質 g una 과 差別性 v i函 a 과 多樣性 nana tv a 을 초월한 브라흐만 Brahman 이 라는 絶對的 存在뿐이 다· 그것 만이 唯一한 實在이 다· 브라흐만은 절대적으로 同質的이며 아무런 성질도 갖고 있지 않는 nir g u I_la 순수· 한 存在 sat 그 自體이다. 이 브라흐만은 우파니샤드의 眞理대로 人間의 참 自我 A t man 로서 (
로서 그 存在는 결코 의심하거나 부정 할 수 없는 가장 확 실 한 것아 다. 왜냐하면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 自 我 폴 前提로 하고 있 기 때문이다. 同時에 自我는 모든 認識 의 主 體 이기 때문에 절 코 對象 化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自我는 우리의 모든 精 神的 作用 내지 認識活動을 동하여 그 背後에서 항시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證 人 saks i n 과 같은 촌재로서 그 自 體 는 결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촌재라고 한다. 샹카라에 있어서 實在의 개념은 否 定될 래야 否定될 수 없 는 abha- dit a,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否 定 된다〉는 말은 어떤 經驗 된 事 質이 또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하여 거짓됨이 드러난다는 뜻이 다. 예를 들어, 꿈 속의 實 在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質 在性울 否 定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샹카라에 의하면 自 我 는 도저히 否定될 수 없는 實在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考 察 한 바 있 는 自我의 네 가지 狀態에 관한 우파니샤드 哲人들의 思惟가 나타 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인 것이다. 즉 깨어 있는 상태에서나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나,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상태이거나 禪 定의 상태이거나를 막론하고 결코 否定당함이 없이 恒存하고 있~ 純粹識으로서의 自我야말로 實 在라는 것이 다. 샹카라에 의하면 이러한 自我가 곧 다롬아닌 브라흐만이요, 브라 흐만만이 唯一의 實 在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日常 的 經驗 vy avahara 의 多 樣 한 현상세계를 샹카라는 어떻게 설명하는 가? 샹카라에 의하면 이 하나의 實 在인 브라흐만은 우리의 無知 av i d ya나 幻術 ma y a 의 힘 sakti 때 문에 雜多한 이 품과 형 상 namariip a 을 가진 현상세계 p ra p a fi ca 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고 한다. 죽 세계 는 브라흐만의 假現 v i var t a 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 이 다. 샹카라의 이 러한 입장울 브라흐만假現說 Brahmav i var t avada 이 라 부른다. 세 계를 브라흐만으로부터 展 開 돼 나온 것으로 보는 브라흐만 轉裝 說 Brahma p a ri1_1 amavada 과 구별되는 理論이다. 兩者 다 브라흐만을 世 界의 質料因 u p adana-kara 1_1 a 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 이 나, 前者는 세계를 브라흐만의 假現으로 보고 後者는 제계를 브라흐만의 轉變 으로 보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자 모두 결과가 원인에 이미 ~
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因中有果論 sa t kar y avada 으로 간주되나, 브라 흐만假現說은 윈인만이 실재하고 결과는 원인의 가현이라고 보는 반면에, 브라흐만轉變說은 결과를 원인의 전변으로 보는 것이다. 샹카라에 의하면 無知 av i d y a 는 存在 sa t도 아니고 非存在 asa t도 아닌 규정 하기 어 려 운 어 떤 것 이 다 anir v acaniy a . 왜 냐하면 브라흐만 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無知도 브라흐만에 근거해야 하는 고로 무지 는 存在 sa t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상세계를 나타나 게끔 하므로 非存在 asa t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無知의 본질은 샹카라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물을 誤認하게끔 하며, 그 위 에 서 다몬 사물을 보게 끔 하는 假託 adh y asa 에 있다고 한다. 예 를 들어 어두울 때 길에서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뿐인데 사람 들이 無知로 인하여 잡다한 현상과 대상의 세계플 그 위에 뒤집어 씌워서 본다는 것이다. 샹카라에 의하면 이 無知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본래 아무런 屬性도 없는 브라흐만 n i r gu 1_1 abrahman 을 世界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主宰神 I§vara 으로서 인식 한다고 한다. 이 神은 세 계의 質料因과 能 動因이며 聖스러운 베다를 鼓吹해 냈고 세계의 윤리적 질서를 보 호하는 者이다. 따라서 샹카라는 브라흐만을, 아무런 속성도 없는 높은 브라흐만 p arabrahman 과 속성을 가지고 현상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낮은 브라흐만 a p arabrahman 의 두 가지로 구별한다. 前 者는 어 떤 형 상 akara 이 나 속성 gu na 이 나 制限 u p adh 죠-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의 言語로는 도저히 表現될 수 없는 순수한 存在이다· 우파니샤드에 따라서 오직 〈무엇도 아니고 무엇 도 아니다 ne ti -ne ti〉라는 否定的 표현 밖에는 할 수 없는 實在인 컷 이 다. 단지 冥想을 동하여 순수 存在 sa t와 순수 識 cit으로 체 험 되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主宰神은 人格的인 神으로서 수많은 훌 륭한 속성과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同時에 制限된 存在인 것아다. 이 神은 人間과 人格的인 關係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宗敎的인 敬拜 u p asana 의 대 상이 되 는 존재 이 다. 샹카라는 이 렇 게 〈높은 브라흐만〉과 〈낮은 브라흐만〉을 區別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의 처서둘을 동하여 두 개념을 엄격히 區別함이 없이 ` 混用하기도 한다. 無知 av i d ya 는 또한 브라흐만, 즉 宇宙의 궁극적 실재인 最高我 p arama tm an 를 수없이 많은 制限된 個人我 ji va t man 로 나타나게끔 한다. 個人我란 다시 말해서 最高我가 無知의 영향 아래서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現象的 自我들인 것이다. 마치 해나 달이 하나이지만 많은 물통에 비칠 때 여럿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혹은 限 없는 空間이 좁은 병 안에서 制限된 공간들로 나타나 보이는 것과 도 마찬가지라 한다· 이렇게 絶對我를 제한된 個人我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감각기관과 意根 manas 과 같은 限定的 附加 物 u p료 dh i들의 영향 때문이며, 이 附加物들은 곧 無知의 所産인 것 이다. 따라서 無知롤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제한된 현상적 자아가 망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絶對的 自我 즉 브라흐만 자체임을 깨달아 ‘ 서 解脫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높은 브라흐만 p arabrahman 과 낮은 브라흐만 ap a ra- brahman, 最高我와 個人我의 區別은 높은 知識 p arav i d y a 과 無知로 因한 낮은 知識 ap a ravid y a , 혹은 窮極的 眞理 p aramar t ha 와 世俗的 眞理 vyavahar i kar t ha 의 區別을 초래한다· 龍樹와 같이 상카라도 철 저한 一元論的인 存在論을 위하여 認識的 二諦說을 주장해야만 한 ` 것이다. 죽 궁극적인 진리에 의할 것 같으면 個人我와 創造神은 어 디까지나 모두 妄想에 지나지 않으나 世俗的인 眞理의 次元에서 볼 것 같으면 個人我와 創造神, 束稱과 解脫, 輪廻 등이 모두 實在하 는事實이라는것이다. 샹카라는 이와같은 知識의 二重性의 이론 에 입 각해 서 베 다와 『기 타』와 『브라흐마經』 等을 철 저 히 一元論 的으로 解釋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베다는 個人我, 業 , 輪 廻, 解脫,創造, 主宰神 등의 實在性을 인정 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 있다. 正統 바라문교도로서의 샹카라는 이들도 다 베다의 聖스러 운 전리이므로 결코 無視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二諦說 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즉, 世俗的 眞理는 窮極 的 眞理로 이끌기 위한 手段的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베다는 兩 者를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베다 自體도 多樣性의 서t
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의 言語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無 知률 제거하고 참다운 인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현상세계의 差別性과 多樣性을 부정하고 最高 我만의 唯一 無 二한 1f [在性을 주장하는 샹카라의 哲學을 不二論的 베 단 타 Advait a Vedan t a 哲學 이 라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 留意할 점은 궁극적 진리의 관점에 따라서 현상 세계가 비록 妄想이라 할지라도 世界는 결코 〈공중의 꽃〉이나 〈토 끼의 뿔〉 과 같은 전혀 근거가 없는 妄想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世 界는 어디까지나 브라흐만이라는 實在폴 근거로 하여 나타난 假現 이지 전혀 事實無 根의 환상은 아닌 것이다. 샹카라는 또한 佛敎의 唯識哲學의 主觀的 觀念論을 배척한다. 샹카라에 의하면 外界가 바 록 假象이기는 하나, 唯 識哲學 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識 v ijii ana 의 轉礎 으로서의 主觀的 假象이 아니라 客親的으로 존재하는 가상이라 는 것이다. 세계는 단순히 觀念上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客觀 的으로 知 1 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人生의 最高 目 標는 至高 善 nil;isr ey a sa, summum bonum 인 解脫 mo~a 에 있다. 샹카라에 의하면 解脫은 오직 知識 vi d ya 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善 한 행위와 神에 대한 敬拜도 물론 해탈에 도움을 주지만 그들은 궁극적 으로 無知 av i d y a 에 근거 한 것으로서 우리 를 현상의 세 계 에 계 속 얽 매 는 것 이 다. 높은 知識 p arav i d y a 은 知~ pr aty ak~ 이 나 推論 anumana 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오로지 啓示 sruti , 죽 베 다의 공부로부터 얻 어 진다고 한다· 베 다 가운데서 도 特別히 知識篇 J喆 na-kanda 인 우파니 샤드(죽 Vedan ta)의 가르침 이 중요하다. 샹카라에 의하면 베다는 全體가 다 神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世俗的인 眞理 의 次元에서 얘기되는 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통하여 샹 카라哲學의 傳統性과 保守性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높은 知識 p arav i d y a 을 얻 기 위 하여 는 베 다의 공부와 더 불어 善한 行爲와 膜想 up a sana, 特히 우파니 샤드의 말들(〈t ad tva m as i〉와 같은)을 경 건하게 熟考하고 反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個人我가 곧 最高我 라는 것을 아는 知識, 현상 세계의 다양성과 윤회의 세계가 환상뿐이라는 知識은 모든 業융 파괴한다고 한다. 지식을 얻은 자에게는 業 도 존재하지 않고 業의 결과인 육체도 더 이상 存在하지 않는 것아다. 그에게는 또 한 지켜야 할 義務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샹카라에 의하면 知識은 業 의 씨 를 태워 버린 다. 그러나 이미 그 씨가 發茅하기 시작한 業, 죽 現 世 의 原因 이 되고 있는 業 은 파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完全한 知識을 획 득한 者라 할지 라도 現在의 몸은 당분간 存紹한다고 한다. 마치 陶 工의 羲轄 가 그릇을 다 만든 후에도 얼마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한다· 그러나 깨달은 자 는 현재의 몸을 파괴할 수 는 없으나 그것에 의하여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 것 이 生解脫 ji vanmuk ti의 상태이며 死後에야 버로소 육체 를 완전히 벗어 버 린 脫身解脫 v i dehamuk ti울 성 취 하는 것 이 다· 한편 낮은 知識의 소유자는 브라흐만을 자기의 自我로 깨닫지 못 하고 創造神으로 믿고 崇拜한다. 샹카라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의 영 혼(個人我)은 死後에 神둘의 길 deva y ana 을 통하여 낮은 브라흐만 a p arabrahman 과 聯合한다· 이 상태 는 아직 解脫은 아니 지 만 潮次 的인 解放 kramamuk ti을 통하여 完全한 知識과 解脫에 이 른다고 한 다. 이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사람은 높은 지식도 낮은 지식도 없 는 사람으로서 단지 善行울 행한 사람이며, 이들은 死後에 祖上둘 의 길 pita,i:i a 을 따라서 달에 도달하여 거 기 서 業의 보상을 누리 고 난 후 또 다시 地上에 태어난다고 한다. 이 때에 輪廻 의 主 體 가 되 는 것은 個人我이 며 , 이 個人我는 無知의 所産인 여 러 附加物 up a dhi 둘을 同伴하고 死後에 存續한다고 한다· 우리 의 거 친 肉體 gro ss bod y는 死後에 물질적 要 素 들로 되돌아가지만 個人我는 다른 附加 物들과 함께 존속하는 것 이 다· 이 러 한 附加物들에 는 意 根 manas 과 감각기 관들 ind riy a, 목숨 mukhy a -pr a i:i a, 細身 suk~masar i ra 이 있 다. 여기서 감각기관이란 것은 육체적인 기관 kara i:i a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能力 혹은 씨를 말하며, 細身온 육체가 파멸한 후 에 도 남게 되 는 〈육체 의 씨 를 形成하는 微細한 要 素 둘 deha-bij an i b hiit a -s uk 훈 ma 떠〉을 의 미 한다· 이 러 한 附加物들은 우리 가 解脫을 얻
기 前까지는 영원히 個人我들에 附着되어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 個人我는 未來 의 生울 결 정 할 業 의 所依 karma-asra y a-를 榎 하는 附加物로 지니고 있다고 한다. 3 샹카라 이후의 不二論的 베단타哲學 샹카라의 不二論的 哲學 은 印度哲學史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막대 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그는 印度의 가장 위대한 思想家로서 推仰받아 왔다. 따라서 그의 哲學은 수많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 들에 의하여 활발한 論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의 著述들에도 다시 많은 주석서둘이 씌어지게 되었다. 샹카라의 재자인 파드마파다 Padmap a da (9 세기)는 『브라흐마經』의 처 음 四節에 대 한 샹카라의 주석 의 復駐인 『판차파디 카 Pa ii ca p a di ka 』 라는 중요한 저술을 했 으며 이 주석은 프라카샤아트만 Prakasatm an (1100 년경 )의 『판차파디 카証解 Pa ii ca p ad i ka-v i vara l) a 』라는 또 하나의 復 許를 낳았다. 한편 샹카라의 제자 수레슈바라 Suresvara 는 샹카라哲 學을 體系的으로 다루는 『나이 스카르미 야싯 디 Na i ~karm y a-s i dd hi』와 샹카라의 『브르하드아라냐카 우파니샤드』의 주석에 대한 復誌를 썼 댜 샹카라의 또 하나의 재 자인 아난다기 리 Ananda gi r i도 『브라흐마 經疏』에 대하여 『냐야니르나야 N y a y an i r l) a y a 』라는 復訪를 저술했다. 한편 9 세 기 의 바차스파티 미 슈라 Vacas p a ti m i sra 도 『브하마티 Bha- mati』라는 有名한 주석을 써서 샹카라哲學을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또한 싸르바주나아트만 (~arva jii a t man, 900 A.D. 경)은 샹카라의 經疏 에서 요점을 추려서 『쌍크셰파샤리 라카 Sarhk~e p a-sar i raka 』라는 綱要 書 풀 처술했다. 이들 샹카라의 추종자들에 있어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는 無知 avid y a , 또는 幻術 ma y a 의 존재 론적 인 가치 에 대 한 문계 였 다· 이 들은 대 체 로 무지 나 환술을 상키 야철 학의 프라크르티 pr akrti 와 같이 다양성의 세계를 산출시키는 어떤 創造的인 原理로 보았 댜 샹카라에 있어서 無知가 단순히 그로 인해 현상세계가 나타나 게 되는 妄想的인 힘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볼때 샹카라의 추종자들
은 無知룰 좀더 웠i 2 { t해서 보는 경향을 기졌음웅 알 수 있다. 그 둘은 도한 無知 는 모든 현상세계를 나타나게끔 하므로 非存在 asat 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存在 sa t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 왜 냐하면 知 jii ana 에 의하여 無知는 사라지게 되며 결 국 브라 흐 만만이 唯一한 宜在이기 때문아다 . 따라서 이들 不二 論 的 철학 자 들은 모두 無知룰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 an i rvacan iy a 이 라고 한다 . 문제는 이 無知가 누구에까, 혹 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륭 둘러싼 여러 철학자들의 입장을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다. 단지 그 要旨 만을 말할 것 같으면 탑은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無知 는 브라흐만에 근거 asra y a 를 두고 브라흐 민을- 대 상 v i ~a y a 으로 하는 어 떤 힘 sak ti이 라는 견 해 이 고, 다 른 하 • 나는 無知는 個人 我 ji va 에 근거 하며 브라흐만은 無知의 對象 온 되 지 만 所依는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만다나미슈라 Ma i;i 4anam i sra3) 와 바차스파티미슈라 Vacas p a ti m i sra 와 같은 베단타 哲學者 는 後者룰 택 하고 있으며 바차스파티 의 訪釋 書 의 이 름에 따라 〈브하마 티 Bhamati> 學派라 부른다. 반면에 수레슈바라 Suresvata , 파드마파다 Padmap a da, 프라카샤아트만 Prakasatm an, 사르바쥬나아트만 ~arvajn a tm an 등의 學者는 前者의 見解룰 취하고있으며 이들을 프라카샤아트만의 許釋 書 의 이 름에 따라 〈비 바라나 Vi va rai;i a> 學 派라 부른다· 브라흐만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 이론의 장점은 世界의 原因울 브라흐만 自體에 서 찾는다는 것이나, 문제는 어떻게 無知가 純粹識 인 브라흐만에 근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브라흐만 自體가 世界의 多樣性에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이다. 반면에 無知의 所依가 個人我 ji va 이며 브라흐 만과는 無關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無知가 브라흐만을 떠 나서 하나의 독립적인 힘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순환논법을 범한다는 것이다• 죽 個人我가 이미 無知 의 産物인데 어떻게 무지 가 개인아에 속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현상세계 믈 브라흐만의 가현으로 보는 브라흐마假現說 Brahmav i var t avada 이
3) 라만와다 나同는一 한『 브人라 物흐로마 싯간디주 되B어ra h왔m으as나 i d dh최 i .!근l 의에 저는자 로다서른, 人전 物몽로적 으간로주 되그고는 있수다레.슈 s바. Dasgupta의 A Hi so ry of India n Phil o sop h y , Vol. II (Cambrid g e , 1932), pp. 82-87 참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난점을 말해 주는 것아다. 상카라의 不二論的 哲學온 도한 슈리 하르샤 (Sr i ha q a, A. D. 1150 년 경)와 그의 제자 칫츠카 (C it sukha, A.D 1220 년경)에 의하여 새롭게 계 승 발전되었다. 前者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처서는 『論破의 美味 Kha l)c_l ana-kha l)c) a-khad y a 』이 고, 후자는 슈리 하르샤의 저 서 에 다가 주 석을 썼을 뿐만 아니 라 『眞理의 燈 Ta tt va- p rad ipik a 』이 라는 독자적 인 처서도 썼다· 이들은 특별히 不二論的 입장에 서서 경험의 세 공계격에했서다 .주 어슈지리는하 르여샤러는 법 龍주樹들의을 방質법在과論 的비으슷하로게 해 자석신한의 正철理학•哲적 學 을입 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모든 사유의 범주들을 牙眉的인 것으로 떨어드리는 破埃的 辯證法에 주력하였다. 결국 唯一한 實在인 브라흐만은 모든 현상세계의 사유의 범주와 言語룰 초월한 실재라는 것이다. 현상세계 또한 두지의 所産이므로 存在 sa t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브라흐만을 근거로. 하여 asray a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세계이므로 非存在 asa t라고도. 규정 할 수 없는, 規定不可能한 anir v acaniy a 어 떤 것 이 다. 따라서 슈리하르샤에 의하면 이러한 모순적이고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하 여 어떤 범주를 채용하여 分析을 하고 限界룰 짓고 하는 행위는 궁 극적으로 무의미하며 자기 모순에 빠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슈리 하르샤는 이 점에서 正理철학이 提示하는 여러 범주들의 定義와 說 明이 공허하고 타당치 못함을 밝히고, 결국 그 범주들은 정의할 수 없고 따라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것은 현상세계 자체 도 궁극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짓 존재임을 말한다는 것이다. 슈 리하르샤는 자신의 論議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철학적 논의가 결국 俗諦에 準한 것임을 말하며, 궁극적인 실재는 직접적으로 깨달아 야 하고, 眞諦와 俗諦의 구별마저 현상세계에서만 타당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슈리하르샤가 正理철학의 범주들을 비판함에 있어 주로 우다야나 Uda y ana 에 의한 定義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정의들이 타 당치 못함을 증명하려고 한 반면에, 그의 제자 칫추카는 좀더 나 아가 범주들의 정의뿐만 아니!2} 범주들의 개념들 자체를 論破하려 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파괴적인 논과분만 아니라 그의 『眞理의
燈 Ta tt va- p rad ipi ka 』에서 不二 論 的 베단타의 여 러 중요 한 개 념 돌 에 대하여 자신의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가 中觀哲 學 의 二 諦 說 을 미 망사학파의 쿠마릴 라 브핫따 Kumarila Bha tt a 의 비 판으로부터 옹호 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는 말하기 를 二諦의 구분은 어 디까지나 現象世界에서 활동하는 지성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궁극 적으로는 非 質 在的이고 眞 理는 하나뿐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가 無知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구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俗諦몰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상세계가 토끼의 뿔 이 나 공중의 꽃과 같이 전혀 근거 없는 非存在가 아니 라, 바 록 假 象 이 기는하나브라흐만이라는 실재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不 二論的 베단타哲學의 實 在觀에 입각한 것이다. *참고문현 Alsto n , A. J., tra ns. , The Nais k armasid d hi of Sr t Suresva r a. London• 1959. Bhatt ac hary a, A. , St ud ie s in Post- S ankara Diale cti cs. Calcutt a, 1936. Bhatt ac ha ryya , K., An Intr o ducti on to Advait a P hil o sop hy . Calcutt a, 1924. Bhatt ac hary ya, V., tra ns., The Ag a masiis t r a of Gau(/,aPii da . Calcutt a, 1943. Chatt er je e , M. M., tra ns., Vi veka-c 쩍ii ma t_1i, or Crest- Jew el of Wi sd om of Sri Saizk ariic iiry a . Ady a r, Madras, 1932. Date , V. H., tra ns., Vedanta Exp la in e d: Sankara's Commenta r y on the Brahma-sutr a s. 2 vols. Bombay, 1954. Datt a, D. M., The Six Ways of Know ing : A Crit ical Stu dy of the Vedanta Theory of Knowledg e . Calcutt a, 1960. Deussen, P., The Sy s te m of the Vedanta , Accordin g to Bii da riiy a 7:z a 's Brahmasu tra s and Sankara's Commenta ry. Chic a g o, 1912. Deuts c h, E., Advait a Vedanta : A Phil o sop hi c a l Reconstr u cti on . Hono-lulu, 1969. Deuts c h, E. and Van Buit en en, J. A. B. , eds. , A Sourcebook of Advait a
Vedanta . Honolulu, 1972. Devaraja , N. K., An Intr o ducti on to Sankara's Theory of Knowledg e . Delhi, 1962. Dvid e vi, M. N., tra ns., The Manduky o pa n is h ad wi th Gaudap ad ds Ki irik a s. Bombay, 1894. Glasenapp , H. v., Der St uf e 1 1weg zum Gott ich en. Baden-Baden, 1948. Guenon, R. , Man and Hi s Becomi ng accordin g to the Vedanta . Lon-don, 1945. Hacker, P., Eig e nti im l ich keit en der Lehre und Tennin o log ie San- kara's, Zeit sc hrif t der deuts c hen Morge nliin d is c hen Gesellschaft , 100 (1950). , Unte r suchung e n 勅 er Te:x te des fr uhen Advait av ii da . 1. Die Schuler Saiz k aras. Main z , 1950. , Vi va ri a: Stu die n zur Geschic lz te der illus io n is t i sch er Kos-molog ie u nd Erkenntn is t h e orie der Inder. W ies baden, 1953. , Klein e Schrif ten (B. lndis c he Phil oso p h ie , ins bes. Advait a- Ved 료 n t a) . W ies baden, 1978. , tra ns., Up ad esasiih a srl. Bonn, 1949. Hi ri y an na, M., tra ns., Vedanta s iir a (by Sadii1 1 anda) : a work oiz Ve- dii nt a Phil o sop hy . Poona, 1929. Jag a dananda, Swami , tra ns., A Th01,sa11d Teachin g s of Srz Sankara- chii ry a (Sankaras Up a desasahasri) . Madras, 1949. Jh a, G., tra ns., Khandana-khanda-khady a . India n Thoug h t, Vol. 1-7 (19 07-1915). , tra ns. , The Chii 11 dog yop a1 1i$ a d (wi th Sankaras Commenta ry) . Poona, 1942. Lacombe, 0., L'Absolu selon le Vedanta . Faris , 1937. Lev y, J. , The Natu re of Man Accordin g to the Vedanta . London, 1956. Madhavananda, Swami . , tra ns. , Brhadii ra 1J ya ka Up an i$ a d. Text witl Translati on of Sankara's Commenta ry. Calcutt a, 1934. Mahadevan, T. M. P. , Gau
, The Plzil o sopl z y of Advait a, wit lz Sp e ci al Refe r ence to Bhii - ratu irtlza -vid y iirii .~ 1y a . London, 1938. , tra ns., Tlze San1ba11dlza-Vii rf i ka of Stt re svara. Madras, 1958. Mukharji, N. S. , A Stu dy of Sa iilw ra. Calcutt a, 1942. Murty , K. S., Revelati on a11d Reason in Advait a Vedanta . New York, 1961 . Nik h il an anda, Swami ., tra ns., The Mi ir;z< !,ullyo pa 1 1i $a d wi th Gau
제패부 敎派的 哲學
제 18 장 限定不二論的 베 단타哲學 1 限定不二論의 宗敎的 背景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 Advait a Vedan t a 哲學은 베다의 知識篇 죽, 우파니샤드 U pani !}ad 의 철학을 일관성 있는 제계로 해석한 것 으로 그 후 인도철학의 가장 정통적인 主流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러나 샹카라의 철학은 종교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 었다. 첫째는 人格的 神에 대한 信愛 bhak ti는 샹카라의 철학에 의 할 것 같으면 窮極的 眞理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俗諦 에 입각한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 神에 대한종교적 신양을구원 의 최고의 길로 간주하는 많은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샹카라의 철 학은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不二論的 철학의 원리에 의 할 것 같으면 인격적인 신과 개인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無知 av idy a 나 幻術 ma ya 에 의 한 브라흐만의 환상적 나타남에 지 나지 않으며 , 영혼의 고통과 속박과 윤회라는 것도 결국 幻術이며 해탈 또한 마 찬가지인 것이다· 샹카라의 知識 j臨n a 의 길이란 결국 이 모든종교 적 노력과 추구를 궁극적으로 無意味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미 후기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의 哲學思想에서 쉬 바 S i va 神과 비슈누 V i 5nu 神에 대 한 신 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 았거니와 이 두 神울 중심으로 한 대중적 신앙운동은 그 후 점점
더 확대되어 中世印度의 종교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서력기원 후 약 200 년경에 대제로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는 『마하바라타 Mahabhara t a 』와 『라마야나 Rama y a l) a 』와 같은 奴 事詩 에도 이 러한 신앙운동은 반영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푸라나 Pura l) a 라고 불리 는 새로운 문헌들 속에서 본격적인 표현을 보게 되었다· 본래 푸라 나 Pura l) a 란 敍 事 詩들처 럼 , 베 다를 연구하는 학파들 밖에 서 韻 文 의 형식으로 전해쳐 오던 문헌으로서, 세계의 주기적인 創造와 解 體, 神들과 聖人들의 계보, 세계의 주기적 기간들과 그동안의 지배 자들, 왕들의 계보 등 〈古 事 〉(〈p ura l) a 〉라는 말의 뜻)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었다· 그러나 쉬바神과 비슈누神의 숭배자들은 이 문헌들에 다가 각각 그들의 신 앙적 내용을 부가하여 약 1000 년경 까지 많은 敎派的인 푸라나들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푸라나들은 실제상 에 있어서 베다보.다도. 더 直接的으로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의 宗敎 的 生活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종래의 정통 바라문주의의 보수적 윤리에 의하여 베다의 學習으로부터 除外되어 왔던 많은 낮은 사회 계급의 사람들과 여자들에게도 푸라나는 큰 호소력을 지닌 大衆的 文獻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비슈누신의 숭배는 비슈누神의 化身 ava t ara 으로 간주되 는 牧童 go pa l a 크리 슈나 Krsna 의 이 야기 를 담고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 bhak ti을 북돋우는 『비슈누 푸라냐 V i~1;>. u-p ura l) a 』와 『바가바타 푸라나 Bh 료g ava t a- p ura l) a』 등을 통하여 더욱더 大衆化되게 되었다. 분만 아니라 굽타 왕조의 지배자들은 비슈누와 그의 化身들에 대한 신앙을 공석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石造神殿과 神像들을 만들어 서 비슈누신 앙을 보급하는 데 큰 공헌 올 했다. 비슈누와 쉬바의 숭배자들은 번거로운 베다적인 제사 yajiia 대 신에 家庭이 나 神殿에서 간단하게 그들의 神像을 모시 고 神 울 공경하고 예배하는 大衆的인 푸자p n j 5 儀式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敎派的 푸라나의 代表的인 것으로서 『비슈누 푸라 나』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푸라나에 나 타나 있는 世界觀은 후세 에 라마누자 Ramanu j a 를 비 롯한 많은 바 슈 누派의 베단타思想家들의 哲學에 宗敎的 基盤울 제공하고 있기 때 문이다.
『비슈누 푸라나』는 叔事詩 『마하바라타』에 언급되고 있는 판차라 트라 Pa fi cara t ra 라고 불리는 비슈누信仰의 一派에 의하여 산출된 문 헌으로서 이 판차라트라派는 『마하바라타』의 『解脫法品』 중의 那 羅延天章 Nara y a I)iy a 이 라는 비 슈누派의 문헌도 산출했 다고 여 겨 진다. 『비슈누 푸라나』에서 哲學的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은 世界 의 創造와 週期的 8 창t에 관한 說話와 牧童 go p a la 크리 슈나의 이 야 기이다· 『비슈누 푸라나』에 의할 것 같으면 비슈누神은 브라흐만으 로서 자기 자신 안에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精神 p uru 惡 과 物質 p rakr ti과 이 兩者를 結合시 키 고 分離시 키 는 時間 kala 의 형 태 로 存在하며 이 三者를 갖고서 創造의 행 위 를 하나의 遊戱 I i Ia 로 서 영위한다. 창조의 과정은 대체로 상키야哲學에서 論하는 物質의 展開과정을 따르나 단지 이 物質의 原初的인 均衡狀態를 깨뜨리는 것은 世界의 定해진 週期에 따라서 神이 精神과 物質을 자극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物質로부터 一次的인 세계의 進化가 이루어지면 物質로부터 展開된 諸要素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卵과 같은 덩어리를 형성하여 물위에 떠 있게 된다. 이 때에 비슈누는 創造神 브라흐마 Brahm 료의 형 태 로 이 宇宙的 卵 속으로 들어 가서 하늘과 땅 과 공중권을 창조하며 諸神과 生命둘을 居하게 한다· 다음에 그는 世界의 維持者안 비슈누神으로서 세계를 유지하다가 때가 오면 세 계의 破坡者 루드라 Rudr~ 로서 세계를 불로써 파괴하고 비를 내려 온 우주를 하나의 大洋으로 만든다· 그리고 비슈누는 이 大洋 위에 있는 쉐사 Se~a 라고 부르는 큰 뱀 위에서 밤의 睦眼과 休息의 상태 로들어간다. 브라흐마 神의 세 계 창조로부터 과괴 에 이 르는 기 간을 一勅 kal pa 이 라 부르며 브라흐마神의 하루의 낮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一助동안 에 세계는 大유가 maha yug a 라 불리는 週期들을 경과하며 各 大유 가는 또한 4 개의 小유가로 되어 있다. 大유가의 길이는 人間에게 는 4,320,000 년이며 神들에게는 12,000 년에 해당한다. 4 개의 小유 가는 크리 타 유가 Krta Yug a 4, 800 년 (神둘의 ) , 트레 타 Treta 유가 3, 600 년, 느바파라 Dvapa ra 유가 2, 400 년, 그리고 칼리 Kali 유가
1,200 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 小유가돌이 경과하는 동안 人間社 會 에 온갖 不法 adharma 은 점 점 더 중가하며 인 간의 壽 命은 점 점 더 단축된 다고 한다. 이 러 한 四期의 小유가들로 된 大유가가 1, 000 번 반복되는 것이 一勅이며 이것이 브라흐마神의 한 낮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루의 낮이 지나면 이 낮과 같은 길이의 브라흐마神의 밤 이 오며 이 때에는 비슈누神은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밤이 끝나면 비슈누는 깨어나서 브라흐마神으로서 세계를 다시 창 조하고 브라흐마神의 낮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브라흐마 神의 낮과 밤은 360 일 100 년간이나 계속되어 반복되며 이 기간이 ~ 나면 時間과 物質과 精神은 無限한 비슈누神 안으로 흡수되어 비슈 누神만이 홍로 남게 되 며 , 그가 다시 遊 戱 를 시 작하면 全過程아 다 시 되풀이되는 것이다. 『비슈누 푸라나』에 있어서 후세의 哲學的 靈感을 불러 일으킨 또. 하나의 說話는 비슈누神의 化身 ava t ara 으로 간주되는 크리슈나의 어 린 시절과 牧童으로서의 이 야기들이 다. 목별히 브린다바냐 Vrndavana 라는 숲에서 전개되는 牧 童 크리슈나와 牧 童 둘의 아내들 g o pi s 과의 열렬한 戀 愛의 이야기는 人間의 靈 魂과 神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AJ 칭으로서 비슈누派의 哲學思想에 重 大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비슈누와 쉬바의 신앙운동은 서력기원 약 6 세기경에 이르러 南 印度의 타밀 Tam il지방에서 출현한 여러 詩人聖者들에 의하여 새로 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종래의 베다 Veda, 서사시(寂 事 詩), 푸라나 등의 언어인 산스크리트語 대신 그들의 지방어인 타밀 語로 시와 노래를 지어 비슈누신과 쉬바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종전보다도 훨씬 더 감정적이 고 개인적인 신앙을 거침없이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宗敎的 갈망은 어떤 非人格的인 절대적 존재로서의 브라흐만과의 合一이 라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人格的인 神과의 강렬한 사랑의 교제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들 타밀地方의 詩人聖者들이 지은 많은 宗 敎的 詩와 노래들은 자연히 聖典으로 수집되게 되었으며 이들 聖 典들은 비 슈누派와 쉬 바派의 敎理形成에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 었다.
쉬바 派 에서는 10 세기경에 나야나르. Na yan 료 r 라고 불리는 歷代의 詩 人 聖 子둘의 讚 歌믈 모아서 12 〈聖典 T i runmura i〉을 편찬하였으 며 , 이 것 은 샤이 바 싯 단타 Sa i va-s i ddhan t a 派의 중요한 聖典을 이 루 었다. 샤이바 싯단타는 13 세기에 일어난 쉬바派의 하나로서 神과 人間의 差異, 人間의 罪와 神의 恩籠을 강조하며, 쉬바 信 {f 0 에 하나 의 神學 的, 哲學的 기반을 제공했다. 한편 비슈누派는 11 세기에 알 바로 Alvar 라 불리는 그들의 詩人聖子들의 노래를 수집하여 4000 〈(N聖 at詩h amD iu vnyia, p 8r2a4b—a n9d2h4a) 에m 〉 를의 하편여 찬 했비 다 롯· 되 이었 다聖고詩 의하 며 편그 찬와은 그나의타 무후니계 자들은 이 聖詩둘을 비슈누神殿에서 정기적으로 노래하며 그들의 신 앙을 표현했다. 알바로들의 詩는 득히 牧童 크리슈나 Kris h na Gop al a 와 牧 童 둘의 아내 g o pi들과의 강렬한 사랑의 기쁨과 고통을 人間과 神과의 理想的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찬미했다. 나타무니와 그의 후계 자들은 슈리 바이 쉬 나바 Sr i -va i~l) ava 라는 유력 한 교파를 형성했다· 슈리 바이쉬나바派는 샤이바 싯단타派와는 달리 베다傳統의 연구 를 통하여 자기들의 신앙과 종교적 思想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산스크리트語로 哲學的 저술들을 산출하여 타밀지방을 넘어 서서 인도 전역에 사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슈리 바 이쉬나바派의 종교적 思想옹 철학적으로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은 라마누자 (Ramanu j a, 약 1055~1139) 였다· 그는 南인도 타밀地方에서 태어난 슈리 바이쉬나바派의 司祭로서, 비슈누신에 대한 신앙의 正 統性과 신앙을 동한 구원의 길을 옹호하기 위하여 『브라흐마 經 과 『바가바드 기타』의 주석서를 써서 샹카라의 不二論的 철학을 신 랄하게 공격하고 독자적인 베단타철학의 전동을 세우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철학은 많은 이와 비슷한 노력 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 라마누자의 思想의 根源은 어디까지나 그가 속해 있던 슈리 바이 수]나바派의 신앙적 전통에 있으며 그의 哲學의 骨格은 그가 존경하 던 슈리 바이쉬 나바派의 學者 야무나 Yamuna (918~1034) 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야무나는 나타무니 Na t hamu ni의 孫子이며 후계자
로서 『바가바드 기 타』의 解釋書인 『기 타 義綱要 G it ar t hasarh g raha .JJ-i춘 썼으며 라마누자의 『기타』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야무나 는 또한 『싯디트라야 S i ddh it ra ya 』라는 그의 著書 에서 상키야와 냐 야哲 學을 빌어서 個人我와 현상세계가 最高神 'is vara 과는 別個의 質 在들임을 論하 고 있다· 라마누자는 바로 이러한 야무나의 思想을 · 이어받아 發展시키고 完成시킨 哲學者 다· 그는 또한 『브라흐마 經 .!! 의 주석서인 『聖疏 Sr i -bha~ y a 』에서 자기가 보다야나 Bodha y ana 라는鬱 사람의 『브라흐마 經 』의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라마누자의 形而上 學 라마누자의 形而上 學 的 立 場 온 단적으로 말해서 샹카라의 不二 論 的 哲學과 상키 야 Sarhkh y a 의 二元論的 哲學의 절 충적 혹은 중간적 인 哲學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샹카라哲 學 의 근본적 입장인 브라~ 만의 唯一한 實在性운 말하면서도 그 안에 상키야철학의 二元 論 的 世界親 죽, 푸루샤 p uru~a 와 프라크르티 p rakr ti의 두 원리폴 포섭하 려고 한다. 라마누자에 의하면 브라흐만이 유일한 실재이다· 그러 나 이 브라흐만은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에서처럼 아무런 屬 ~ 도 없는 순수한 非人格的 촌재 가 아니 라, 屬性 sa g una 과 差別性울· 지 닌 savis e ~a 人格的인 神이 다· 따라서 라마누자철 학을 限定不二論 V i si~t죠 dva it a 이 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서 브라흐만은 多樣性과 屬 性 을 지닌 一者이다· 그의 속성 혹은 樣態 p rakara 에는 두 가지가 있 다. 죽 물질 a cit과 1) 영 혼 cit이 다. 물질과 영 혼은 브라흐만을 떠 나 서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못하며, 언제나 브라흐만에 의존하~ 브라흐만은 그들의 實體 p rakar i n 이다. 영혼과 물질은 바록 브라흐 만의 屬性이 기 는 하지 만 샹카라哲 學 에 서 처 럼 幻術 ma y료이 아니 라 實在하는 存在들로 간주된다· 라마누자에 있어서 〈마야〉란 無知 av i d y a 를 의 미 하지 않고 神의 창조적 힘 을 말한다. 따라서 라마누
I) 〈 a cit〉란 非精神的 인 것이라는 말로서 , 엄격히 말하면 物質 pr akrti 뿐만 아니라 時間도 이 법주 안에 속한 다. 라마누자에 의하연 시간은 勝論哲t상에 서처럼 하 나 의 獨立된 賞體 가 아니며 그 명 다고 상키야哲學에서처럼 物質 의 作用 도 아니다 . 時r.:l은 神 안에 내 재 하는 實在 로서 神은 시 간의 도웅으로 창조황동운 한다고 힌 다.
자는 샹카라의 二諦說이 나, 이 에 근거 한 〈높은 브라호만 pa ra- brahman 〉과 〈낮은 브라흐만 a p arabrahman 〉의 구별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마누자는 브라흐만과 世界, 죽 영혼들과 물질과의 關係를 영 혼과 육체와의 관계에 準하 여 說明한다. 영혼과 육제는 서로 다르 나 육체는 영혼 없이 存在할 수 없으며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神은 個人의 영혼들과 물질세계의 內制者 an t ary am i n 이 며 이 들은 神에 依存하고 있 다는 것 이 다. 혹은 라마누 자는 神과 世界와의 관계를 全體와 部分의 관계로서 설명하기도 한 댜 물질과 영혼들은 神의 部分들과 같다는 것이다. 샹카라와 라마누자는 모두 세계가 브라흐만에 依存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상카라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는 브라흐만의 假現인 반면에 라마누자에 있어서는 세계는 이미 브라흐만 안에 內在하여 있다가 그로부터 轉變 하여 나온 實在인 것이다· 라마누자에 의하면 브라흐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하나는 세계가 아직 브라흐만 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세계가 해체되어 pra laya 브라흐만에 吸收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것을 브라흐만의 原 因的 狀態 karana_avas t ha 라 한다· 다른 하나는 세계가 브라흐만으 로부터 전개되어 sr~!i 나왔을 때의 상태로서, 이것을 브라흐만의 結 果的 狀態 kar y a-avas t ha 라고 부른다. 브라흐만은 그 안에 부분과 差別性을 지녔으며 세계의 내적 지배 자이며 세계의 質料因도되고 能動因도 되지만, 브라흐만자체는 변 화하거 나 움직 이 지 않는다. 그의 속성 과 양태 p rakara 들만이 袋 化 할 뿐이 다· 神은 世界를 超越하는 存在이 다· 그는 무수히 많은 完 全한 性品둘을 지니고 바이쿤타 Va i ku i;it ha 라는 天界에서 다른 神들 과 聖子들과 解放된 영혼들과 함께 居하고 있다. 그는 世界라는 육 체를 지녔지만 그의 육체는 그를 속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박 이란 業의 結果인 반면에 神은 바로 業 의 主宰 者 이기 때문이다. 世界가 解體될 때 에 는 物質 p rakr ti은 미 세 하고 無區分的 avib h akta 인 潛在的 狀態로 있으나 神은 이러한 物質로부터 영혼들의 業 에 따라서 그들의 몹과 감각기관들과 대상들의 세계뭉 展開 시칸다고
한다· 神의 全有방한 意志에 따라서 미세한 상태의 물질은 우선 火 • 水 • 地의 미세한 要素둘로 바뀌고 이들이 섞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多樣한 現象世界를 이 루는 것 이 다. 火 • 7k • 地의 三要素는 사트바 sa tt va 와 라자스 ra j as 와 타마스 t arnas 라는 物質 p rakr ti의 三性質을 각각 나타낸다고 한다. 상키 야哲學과는 달리 라마누자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物質의 三要素가 아니 라 三性質(愚性)으로 본다. 라마누자에 의하면 라자스와 타마스의 성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사트바만의 성질로 된 特殊한 物質도 存在한다· 이 물질 은 따라서 非精神界 ac it 보다는 精神界 cit에 屬하는 것 으로서 , 神 이나 解放된 者들의 몸과 그들이 거하는 곳에 있는 事物둘은 이러 한 特殊한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한다. 영 혼 ji va 들은 비 록 브라흐만의 樣態요 그의 몸의 一部이 기 는 하 지만, 그들 나름대로 영원히 實在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 은 어디까지나 神의 樣態인 고로 有限한 존재인 것이다. 영혼은 原 子 anu 의 크기만한 個別的 單子둘로서, 그들은 本質에 있어서는 同 一하다고 한다. 세계의 창조의 상태에서는 영혼들은 각각 그 業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있으나 세계의 해체상태에서나 혹은 解放된 영 혼은 육체로부터 벗어나 존재한다. 영혼은 육제나 감각기관이나 意 根 rnanas 이나 호흡들과는 다로다. 영혼은 윤회의 세계에서 無知와 業으로 인하여 자신을 이들과 혼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동 에서 생기는 自我意識으로서의 我漫 ahamk 료 ra 은 영혼이 본래 가지 고 있는 自意識과는 다르다고 한다. 영 혼은 앎과 행 위 와 경 험 의 主體이 다(jiia t r, kartr , bboktr ) • 영 혼 은 그 자체에 있어서 빛을 가진 svay a mp ra kasaka 自意識的인 존재 이다. 영혼은 자기 자신을 알기도 하고 대상을 알기도 하며 자기 자 산을 드러내나, 對象올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한다. 대상은 오직 知 識(앎)을 동하여 영혼에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에 知識은 그 자체 와 대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들을 알지는 못한다· 아는 것은 영 혼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마누자는 미망사의 프라브하카라 Prabbakara 와 같이 知識이 란 스스로를 드러 내 는 自 明한 것 이 라고 한 다· 그러나 프라브하카라와는 달리 지식은 영혼의 本質的인 성질이
지 偶然的인 성질은 아니라고 한다. 知識은 깊은 수면의 상태나 해 방된 상태에서도 언제나 영혼에 존속한다는 것이다· 지식이 영혼의 본질적인 성질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라마누자는 샹카라처럼 영혼 그 자체가 知識 혹은 純粹識 cit이 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마누 자에 의하면 순수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識이란 어디까지나 주체에 속하며 대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識은 언제나 限界되어 져 있고 特殊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의식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아무도 〈나는 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지식도 영원하며 ~ 래는 遷在的 v i bhu 이 고 無限하고 全知的이 라고 한다· 그러 나 우리 의 業의 제한과 방해를 받아 우리의 지식은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 이다. 지식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본질적으로 희열 ananda 울 갖고 있다 고 한다. 따라서 현상세계에서의 불완전함과 고동들은 영혼의 본질 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해방된 영혼은 무한한 지식과 영원한 행 복을 누리는 것이다. 3 解脫論 라마누자에 의하면 영혼의 해방은 無知와 業의 제거를 동해서 이 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라마누자는샹카라와는 달리, 行爲 karma 와 知識 j臨 na 을 둘 다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베 다의 연구에 있 어 서 도 行爲篇 Karma-ka l}.q. a 과 知識篇 Jiian a-kal}.q .a , 그리 고 푸르바 미 망사 Purva-m i ma I!l sa 와 웃타라 미 망사 Ut tar a-mi - ma I!l sa 를 둘 다 강조한다. 죽 푸르바 미 망사의 연구는 베 단타철 학 의 연구몰 위한 준비로서 간주되며 행위는 순수한 마음으로 神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면 영혼의 淨化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행위에 대하여 지식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샹카라 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라마누자에 의하면 해탈이란 궁극적으로 영혼은 물질과 다르다는 認識에 의하여서 가능한 것이 라고 한다. 그러나 라마누자가 말하는
認識이란 단순한 베단타철학에 대한 知的 理 解 가 아니라 요가的 膜 想을 동하여 얻어진 지식으로서, 이러한 지식은 영혼을 物質 의 束
웰 과 輪 廻의 세계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한다. ::::z..러나 이렇게 物質 로 부터 해방된 영혼은 육체 를 떠나 순수하게 존속하기는 하나 아직도 神과 함께 居하는 幸福에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最高 의 구원은 오직 神에 대한 사랑의 膜想 을 실천하는 信愛 의 요가 bhak ti-y o g a 를 통하여 서 만 가능한 것 이 다. 信愛 란 神 에 대 한 끊임 없 는 記 憶 dhruva-sm rti과 膜 想 up a sana, dh y an il. 을 의 미 하며 , 이 러 한 信愛률 행하는 者는 神에 대한 직접적인 直觀 的知 識을 얻 으며 자 기 는 神의 殘 餘 物 se~a 에 지 나지 않는 존재 로서 그에 게 全的으로 依 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信愛의 요가는 베다에 대한 膜想을 필요로 하므로 슈드라階 級 의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를 수 없다. 따라서 라마누자는 이러한 사람들 올 위하여 別途의 구원의 길을 提示하고 있다. 죽 누구든 지 神울 믿 는 마음으로 그를 向하여 자기 자신을 批 棄 p ra p a tti하고 歸依 하 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者는 神의 恩 籠 p rasada 에 의하여 구원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마누자는 生解脫 ji vanmuk ti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혼 이 業 의 결과인 육체와의 교섭을 떠난 상태, 죽 死 後 라야만 비로소 解脫이 가능한 것이다. 라마누자에게 있어서는 個人的 姬 魂과 束簿 과 輪廻가 단지 無知로 인해 나타나 는 幻術 ma y a 일 수는 없다. 따 라서 解脫의 상태란 영혼이 브라흐만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든가 혹 온 그 속에 흡수되어 個別性울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神과 個人 靈 魂과의 差異는 언제나 남아 있으며, 영혼은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그 固有의 完全性을 회복하고, 순수한 사트바 sa tt va 的인 몸을 갖고 서 無限한 幸福 속에서 神과 사랑의 交 際 를 享 有한다는 것이다· 라마누자의 死後 그의 추종자들은 벤카타나타 Venkata n ii tha ( 혹 은 Ved iinta- desik a , 14 세기 )를 중심 으로 하는 북쪽의 바다갈라이 Vaga g a lai 派와, 로카차리야 (Lokacary a, 13 세기 말)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의 텐 갈라이 Ten g ala i派로 分立되게 되었다· 이 양파는 神의 恩 龍 과 人間의 勢力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를 지녔다. 바다갈라이派에 의하면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淨化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치 어란 원숭이가 어머니의 목에 매달리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산 에게 매달리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텐갈 라이派는 그러한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人間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마치 고양이가 입으로 자기의 새끼를 물어울려 서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듯이 신은 그의 은총을 罪人들에게도 선사 하며 그들을 윤회의 세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다. 라마누자의 철 학은 많은 후계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샹카 라나 또 하나의 위대한 베단타철학자인 마드바 Madhva 의 문하생들 과 같이 철학적 능력이 예리하고 뒤어난 사상가들을 배출하지는 뭇· 했다. *참고문현 Bhatt , S. R. , St u die s i11 Ri im i inu ja Vedanta . New Delhi, 1975. Carman, J., The Theolog y of Ri im i im t ja: An Essay in lute r relig iou s Understa 1 1di1 1g . New Haven, 1974. Dim mi t, C. and J. A. B. van Buit en en, tra ns., Classic a l Hi nd u My tho log y: A Reader in the Sanskrit Purii1 7a s. Ph ila delph ia, 1978. Ghate , V. S. , The Vedanta : A St ud y of the Brahma-Sutr a s wi th the Bhasya s of Sankara, Ramauuja , Ni m barka, Madhva and Val! ab ha. Poona, 1926. Kumarapp a , B., The Hi n du Concep tion of the Deit y as culmi na ti ng in Ri im i i11u j a . London, 1934. Lacombe, 0., L'Absolu selon le Vedanta : Les noti on s de Brahma et d'At m an dans !es sys te m es de 9a11kara et Ri i111 i i1m j a . Paris , 1937. , tr ans. , Grands Theses de Ri im i i1m j a . Paris , 1938. ——-, tra ns. , La Doctr i n e Morale et Meta p h y s iq u e de Ri im i inu ja . Paris, 1938. Lott , E. , God and the Univ e rse in the Vedanta Theolog y of Ri im i i• nuja : a stu dy in !tis use of the Self- B ody Analog y. Madras, 1976.
, Vedant ic A p pro aches to God. London, 1980. Narasim ha-Ay ya ng a r, M. B. , tra ns. , Vedauta - Sii ra of Bhag a vad- Ri im i inu ja . Madras, i953 . Ot to, R., tra ns., Sid d lzii ut a des Ri im i iuu ja . Jen a, 1917, Ti ibin g e n, 1923. , Vis l mu-Nii rii ya~ za. Jen a, 1917. Rag b avachar, S. S., Sri Ri imi inu ja 011 the Up an is h ads. Madras, 1972. Rang a cbary a , M. and M. B. Varadaraja Ai yan g a r, tra ns. , Vedii nt a Sii tra s wi th Sri Bhii$ ya of Ri im auuji ichi i, ry a . 3 vols. Madras, 1965. Srin i v a sa, cbTahrei, PPh. iNl o. s, opT hlyz e oPf h Vil io ssio $pf hi iyd v oafi t aB. h eMdaiid brlz aesd,a . 19M43a. dras, 1934. , Ri ima 11uj a 's Idea of the Fi n it e Self. Calcutt a, 1928. Samp a tk u maran, M. R., tra ns., The Gi tii-B lzii$ ya of Ri im i inu ja . Ma-dras, 1969. Thib a ut, G., tra ns., The Vedii nt a - sutr a s wi th the Commenta ry of Ri im i iuu ja . Part ffi .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Vol. XLVIII. Ox for d, 1904. Varadacbari , K. C., Sri Ramanuja 's Theory of Knowledg e . Ti ru p a ti , 1943. Van Buit en en, J. A. B. , tra ns. , Ri im i inu ja on the Bhag a vadg itii. The Hag ue , 1953. , tra ns., Ri imi inu ja 's Vedii rt h a-Sa'f{ lgr aha. Poona, 1965. Wi lson , H. N., tra ns., The V硏 Purii~ a . New York, 1969. Rep r in t of the 1840 ed ition . Zim mer, H., My ths and Sy m bols in India n Art and Ci vi l izat i on . New York, 1946.
제 19 장 비슈누派의 베단타哲學 1 라마누자 이 후의 印度哲學의 傾向 베단타哲學이 일단 라마누자에 의하여 샹카라의 不二論과는 달리 신앙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 보여침에 따라, 그의 철학은 베단타 思想史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라마누자의 뒤를 이어 나 타난 여러 바슈누派와 쉬바派의 철학자들은 모두 물질세계와 영혼 울 주저없이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과 最高神으로서의 브라흐 만과의 관계를 각기 자기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라마누자만 하여도 영혼과 물질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不二論的 advai ta 입장, 즉 브라흐만만이 유일한 實在라는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반 면에, 그들은 더욱더 영혼과 물질이 브라흐만과는 별개의 실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구원의 방법으로서도 라마누자 는 知識과 信愛와를 결부시켜 해석하는 반면에, 이들 信仰的 베단 타 철학자들은 信愛만이 유일한 길임과 신의 은총을 강조하여 中世 인도의 종교적 경향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라마누 자를 전환점으로 하여 이들 信仰的 敎派的 사상가들에 의하여 전개 된 神學的 救援論으로서의 철학들은 印度哲學의 하나의 큰 흐픔을 형성하게 되었다. 샹카라의 不二論的 철학은 어떤 特定한 神을 섭 기는 宗派적 입장을 초월한 것이었으나, 라마누자 이후의 베단타철 학자들은 모두 특정한 宗派的 입장에 서서 베단타 사상을 각각 자
기 나릉대로 해석하고 있 는 것 이다. 반면에 이와 같은 이유 로 해 서 샹카라의 哲學 은 어떤 特定한 神 만 을 섬기지 않고 諸神을 義 務로 서 관습적으로 섬기는 많은 正 統 바라문들에 의하여 지지 룽 받아오 게 된 것이다· 2 마드바의 二元的 베 단타哲 學 마드바 (Madhva, 1199~1278) 는 西南印 度 의 우디 피 Ud ipi라는 곳에 서 태 어 나서 일 찍 부터 베 다를 공부하고 苦行 者 sarhn y as i n 가 되 었 다. 그는 본래 샹카라哲 學 의 추종자였으나 그의 스승이 며 샹카라哲 學의 信奉者인 아츄타프렉 샤 Ac y u t a p rek::_;a 와의 論爭을 통하여 샹카 라의 哲學을 버리고 二元的인 베단타哲 學 을 展開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그는 비슈누神과 그의 化身 크리슈나를 至高의 神으로 섬기는 者로서 여러 地方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改宗시켰으며 자기의 고향인 우디피에다 크리슈나神을 위한 神殿을 만들고 그의 활동 의 本棟地로 삼않다. 마드바는 많은 著書둘을 남겼다· 그는 『브라흐마 經』 , 우파니 샤 드, 『바가바드 기 타』, 『마하바라타』, 『바가바타 푸라나』 등에 解釋 書믈 썼으며, 자기의 베단타哲 學 을 옹호하는 『 隨解說 Anu vy akh y ana 』 을 비롯하여 · 多數의 짧은 哲學的 論文들도 처술했다. 마드바의 사상을 계승한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은 자야티르타(J a y a ti r t ha, 14 세기)로서, 그는 마드바의 『브라흐마 經 疏』의 復駐인 『眞理解明 Ta ttv a p rakas i ka 』과 『 隨解說 』의 주석 서 인 『正理甘露 N y a y asudha 』를 썼다. 자야티르타의 처서둘은 또한 뱌사 티르타 V y asa tirt ha 와 라가벤드라 야티 Rag h avendra Yati 등과 같은 후계자들에 의하여 대대로 주석되었다· 마드바와 그의 추종자들은 특별히 샹카라의 不二 論 的 베단타哲 學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많은 論爭을 벌였다. 마드바는 認識의 方法 p rama l). a 으로서 知登 p ra ty ak::_;a 과 推論 anu- m 무과 聖典 a g ama 을 인정한다. 質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는 중 언에 의지하여야 하며, 聖典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人 間的 인
것 p auru~e y a 과 절 대 적 확실 성 을 가진 超人 間的인 것 a p auru~e y a 의 二 種 이 있다고 한다· 베다는 후 자의 것으로서 어떤 인간적 처자를 갖 고 있지 않는 것아다· 인식은 반드시 主 體 와 客f효 로서 구성되며 양 자의 관계는 直接 的이다· 인식에는 파악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明 證 性이 있다고 한 다. 이 명중성은 직관의 主 體 (sak~ i n, 〈 證 人〉)로 서의 自 我가 갖는 명 중성인 것이다. 마드바에 의하면 우리의 지식 은 별 다른 障問 와 결함 아 없는한 自 意識 的인 직관적 주 체 에 의하여 그 타당 성 혹 은 자명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마드바의 지 식 의 本有 的 采當性 s v a t a l)-p rama i:iy a 에 대 한 견해 이 다. 뿐만 아 니라 설 령 우리의 認識 에 결 함이 있어서 그릇된 인식이 발생한다 하여도 그 인식도 어떤 客觀 的 對象 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룻된 인식이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 any a th a vij iian anam eva bhran til)이 다. 이 렇 게 볼 때 현 상세 계 는 순 전히 妄 想 일 수가 없으며 妄 想 이란 質 在하는 어떤 것아 다른 어떤 것 으로 나타나 보언 뿐 이지 전혀 아무런 대상도 存 在 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릇된 것이라면 옳 은 관념과 툴린 관념의 차이는 설명될 수 없으며 , 事 物의 客 競的 差 別이 없다면 우 리가 가지고 있는 觀 念 들 의 差 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드바에 의 하면 實 在 p adar t ha 에 두 종류가 있 다• 하나는 獨立的 svata n tr a 實在요, 다른 하나는 依他的 pa rata n tr a 實 在이 다· 神만이 독립 적 실 재 이 며 의 타적 실 재 는 有 bhava 와 無 abhava 로 구분된 다. 有 에 는 意識 的인 ceta n a 영 혼들과 無意識 的인 aceta n a 물질 이 나 시 간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 無意識 的인 존재에는 베다처럼 영원한 것도 있고 시간, 공간, 물질 p rakr ti처럼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 지 않기도 한 존재도 있으며, 물질의 展 開 物 들과 같은 영원하지 않 은 것이 있다. 마드바는 샹카라의 不二 論 的 哲 學 을 佛 敎 의 空思 想 에 영향을 받 은 거짓된 이론으로 신랄히 공격하며, 差別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 정하는 세계관을 세웠다· 그는 라마누자와 같이 神과 磁魂 과 物 質 을 각각 영원한 실재로 간주하고 이 三者간에 五 種 의 差 別 pan.ca - bheda 이 있읍을 주장했다. 죽 영혼과 · 신, 영혼과 영혼, 영혼과 물
질, 신과 물질, 그리고 물질로 된 事物들 사이의 差 別이다. 神 V i snu 은 무한히 많은 성질들을 지니고 있으며, 삿트 sa t(存在) 와 칫트 cit(識)와 아난다 ananda( 喜稅)를 그의 본질로 삼는다· 그 는 世界의 創造者요 維持者요, 破坡者이다· 그는 自身울 여러 形態 v yii. ha 와 化身 ava t ara 으로 나타내 며 聖스러 운 神像들에 現存하고 있 댜 神은 세계의 超越者이기도 하며 세계와 영혼들의 內的 支配者 로서 內在하는 자이다. 물질과 영혼은 全的으로 神의 意 志에 依存 하고 있다. 마드바는 神의 意志와 活動을 강조한 나머지 영혼들이 비록 제한된 자유와 의지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구원이 神 의 決定에 달렸다는 一種의 豫定說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그의 哲 學은 存在論的으로는 多元論的이 지 만 萬有가 신의 의 지 와 힘 에 종 속되고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機能的 一元論울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다. 마드바는 라마누자와 같이 神과 世界(죽 물질과 영 혼들)와의 관계를 영혼과 몸의 관계로 보거나, 세계를 신의 屬性이나 樣 態로 보지 않는다. 영혼들과 물질들은 비독 신에 의존하지만, 신과는 別 個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신은 세계의 能動因이기는 하나 質料因은 아니다. 여기서 마드바는 決定的으로 『우파니샤드』나 『바 가바드 기 타』의 萬有內神論 p an-en- t he i sm 的인 世界觀으로부터 벗 어 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드바의 哲學的 立場을 二元的 베단 타 Dvait a Ved 죠n t a 라 부르며, 샹카라의 不二論이나 라마누자의 限定 不二論과 구별한다. 영혼 ji va 둘은 영원하고 무수히 많으며, 크기에 있어서 原子的이 라고 한다. 마드바에 의하면 챠이나敎에서처럼 땅 위의 모든 存在 둘은 生命 ji va 이 있는 有機體들이 다. 영 혼은 識을 갖고 있음으로 해 서 그것아 屬해 있는 物體에 過在해 있다. 이런 면에서 모든 事物 에 返在해 있는 神과는 다른 것이다. 영혼은 本性上 識과 喜脫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業의 결과인 物質的인 몸과 감각기관과의 연 결 때문에 苦痛과 不完全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神이 비록 영혼들 을 내적으로 지배하지만, 그들은 각기 行爲와 知識과 經驗의 主體 이 다· 마드바는 영 혼의 認識器官을 證人 sak~ i n 이 라 부른다. 이 것을 몽하여 영혼은 스스로를 의식하며 이것이 영혼의 個別性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마드바에 의하면 영혼들은 質 的으로도 相異하다고 한 다. 각각의 영혼들은 그 자체의 특수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따라서 解放된 상태에서도 그들의 識 과 喜 稅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고한다. 영 혼에 는 永 遠 히 自 由로운 영 혼 n ity a-muk t a 과 解放된 영 혼 mukta 과 束縮 된 영 혼 baddha 의 三 種 이 있 다. 비 슈누神의 創造的 힘 의 人 格 化이 며 그의 아내 로 간주되 는 락스미 Lak~m i는 다른 神들과는 달 리 본래부터 영원히 自由로운 존재라고 한다. 束 博 된 영혼들 가운 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과 그렇지 못한 영혼의 구분이 있으며, 後者 는 영원히 輪 廻의 世界에서 방황하는 存在들이다. 마드바에 의 하면 아무리 순수한 영 혼들이 라 할지 라도 神의 完全한 喜 稅은 못 느끼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느낄 뿐이며, 신과 영혼의 차이는 엄연 히 존재한다고 한다. 영혼은 결코 브라흐만과 같이 Brahma-pr akara 될 수는 없다. 物質 p rakr ti은 神에 의 하여 形態를 가진 現 象 世界로 展開되 며 世 界의 解 體 時에는 事 物들은 다시 . 原初的인 物質로 되돌아간다. 展 開 以前의 미세한 상태의 物 質 은 同質的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온 相 異 한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마드바는 無明 a vi dy a 을 物 質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無明에는 영혼의 영적 능력을 隱 薇하는 jivac chadik a 것 과 神을 영 혼으로부터 隱 薇하는 pa ramacchad ika 것 의 二 種 이 있다고 한다· 마드바에 의하면 倫理的인 義 務의 執 着 없는 순수한 실천은 영혼 의 구원에 도움은 되지만, 구원은 무엇보다도 神을 아는 知識에 의 하여만 가능한다고 한다• 이러한 知識을 위해서는 베다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자와 슈드라階級은 베다 대신 푸라나 Pur~a 나 傳 承 smr ti둘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神을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그에게 철대적으로 依存하고 있다는 감정과 그에 대한 사랑을 가져온다· 이것이 곧 信愛 bhak ti이며 信愛는 神에 대 한 깊은 膜想 n i d i dh y asana 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러한 膜想과 神 의 恩 龍 p rasada 을 통하여 그에 대 한 直接知 a p arok~a jii ana 를 얻 는다 고 한다· 이 直接知는 바로 現世에 있어서도 우리를 세계의 속박으
로부터 자유캐 한 다. 해방된 영 혼들 은 死後 에 비슈누祠i의 樂 園에서 순수 사트바적인 몸을 입고서 각종의 유 희 와 찬미 속에서 우한 한 행복을 누란다고 한다. 3 님 바르카의 二而不二論 님바르카 N i mbarka 는 텔루구 語 Telu g u 를 사용하는 南印度 출산의 바라문이었다· 그는 크리슈나神의 열렬 한 숭 배자로서 크리슈나 派 의 聖域인 브린다바나 Vrndavana 죽 北印 度 의 마두라 Math ura 지 방에 서 일생을 보냈다· 그의 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12~13 세기경의 人 物로 추정된다· 님바르카도 역시 『브라흐마 經 』의 주석서인 『베단타 파리자타 사 우라바 Vedan t a- p ar ij a t a-saurabba 』를 썼으며 또한 자기의 哲 學 的 立 場을 간략하게 주장하는 『十碩 Dasaslok i』을 지 었 다· 그의 哲 學 온 스 리 니 바사 (Sr i n i vasa, 14 세기 ), 케 샤바카슈미 린 (Kesavakasmi re in , 16 세 기)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케샤바는 『기타』의 주석인 『 典 理解明 Ta tt vap rakas i ka 』에 서 님 바르카의 사상을 옹호했 다. 님바르카는 라마누자의 哲學에 많은 영향을 입고 있으며 브하르 트르프라판차 (Bhar t r p ra p a ii. ca, 8 세 기 ), 브하스카라 (Bhaskara, 10 세기 ), 야다바 (Yadava, 12 세기)와 같은 베단타哲學者에 의하여 대표되었던 差別不差別論 bhedabheda 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죽 神은 세계의 能動因이며 質料因으로서 신과세계와의 관계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 도하다는 견해이다· 그는 라마누자와는 달리 물질과 영혼들이 神의 屬性이거나 혹은 神의 몸을 이룬다는說울 인정하지 않는다. 속성이 란 어떤 존재를 다른 것으로부터 區別해 주는데, 神 외에 그로부터 구별되어질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고로 속성이란 無意味하 다고 한다· 또한 만약 물질과 영혼들이 神의 몸을 이룬다고 하면, 神온 세계의 온갖 不幸과 不完全함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神의 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님바르카에게는 영혼과 물질은 신 에 依存하고 있으며, 이 依存性 p ara t an t rasa tt료 -bhava 은 그들과 神과 의 差別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과 영혼은 獨立性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svata n tr a satt a-a bbava, 이 독립성의 결여는 그들이 神과 同一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닙바르카는 二而不二論 Dvait ad - va it a-vada 을 주장한다. 마치 태 양과 태 양빛 , 불과 불꽃, 大洋과 파 도의 관계처럼 神과 世界는 같기도 하고 다로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계는 神의 본성 안에 이미 미세하게 존재하고 있던 것의 轉復 p ar ii:1 ama 이 지 假現 v i var t a 이 나 幻術이 아니 다· 神은 자기 안에 識 - c it과 無意識 ac it, 즉 영 혼과 물질 이 라는 힘 sak ti을 지 니 고 있으며 이 힘이 창조 때에 展開되어 나오는 것이다. 神은 世界의 質料因인 것이다· 그는 또한 창조때에 영혼들을 각기 그들의 業에 따라서 알 맞는 業報몰 받도록 하는 세계의 能動因이기도 하다. 님바르카에게 있어서는 神은 곧 크리슈나神을 말하며 크리슈나는 神의 化身이 아 니라 그의 본질이라고 한다. 님바르카는 또한 크리슈나의 愛人 라 다 Radha 를 神의 創造的 힘을 나타내는 原理로 삼았다· 無意識物 a cit에는 三種이 있다. 즉 時間과 物質(p rakr ti, 혹은 ma- y a) 과 物質로부터 나오지 않는 순수한 사트바 sa tt va 이며, 이 後者 로서 神의 股體나 居處는 되어 있다고 한다· 영혼 ji va 은 無知의 결과인 業에 의하여 가리워진다. 영혼의 해방 을 위 해 서 는 知識과 神울 向한 自 己勘棄 p ra p a tti와 信愛 bbakti , 그 리 고 그의 恩籠이 필요하다• 4 발라바의 純淨不二論 발라바 (Vallabha, 1479~1531) 는 텔루구地方 출신 바라문의 아들로 서 베나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님바르카와 마찬가지로 마두라 부 근에서 활약했으며 크리슈나敎의 一派룰 創始했다· 『브라흐마經』의 주석 『아누브하시 야 Anubha~ y a 』와 『바가바타 푸라나』의 주석 인 『바 가바타티 카 수보디 니 Bha g ava t a- p ka-subodh i n i』를 썼으며 , 『眞理燈火 解釋 Ta tt vad ip an i bandha 』이 라는 著書, 그 외에도 수많은 작은 처술 들을 했다· 그의 哲學은 그의 아들 비 탈라나타 V itt halana t ha 와 그밖 에 기 리 다 라 고스바민 Gi ri d h ara Gosvami n, 발 라크리 쉬 나 밧타 Bala- lq~i;ia Bhatt a, 푸루숏타마 Puru~ott am a 등에 의 하여 발전되 었다·
그의 철학적 입장은 브라흐만이 세계 를 전개할 때에 幻 術 ma y a 과 같은 불순한 원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 라 하여 純淨不二 論 Suddhad- va it a 이 라 부른다. 또한 최고의 해탈의 상태는 信 愛 bhak ti 를 통한 신의 은총의 길에 의 하여 가능하다고 하기 대문에 恩 龍 의 道 Pu~ti - m 료 r g a 라고도 부른다. 발라바에게는 브라흐만은 곧 크리슈나神으로서, 그의 본질은 存 在 sa t와 識 cit과 喜 稅 ananda 이 다. 세 계 는 불에 서 불꽃이 나오듯, 혹은 등불로부터 빛이 발하듯 神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영혼들과 물질은 神의 힘 sak ti의 顯 現으로서 全 體 a m. s i n 와 部分 amsa 의 관계 처럼 神과 그들은 同一하다고 한다· 브라흐만은 그의 의지에 의하 여 물질과 영혼들을 현현시키되 그들은 그의 세 가지 성품을 각각 다른 바율로. 나타낸다고 한다. 즉 브라흐만의 存在 sa t로부터는 物 質의 世界가 나오고, 그의 識 cit으로부터는 原子와 같은 영혼들, 그리고 그의 喜稅로부터는 영혼을 지배하는 內的 支配 者 anta r ya m i n 가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물질세계에는 브라흐만의 識 과 喜 稅~ 숨겨져 있고, 영혼에는 그의 喜 脫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神은 세계의 能動因이고 質 料因이며 그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 여 있는 內在因 samava yi -kara l). a 이 다. 혹은 神은 온 우주의 최 고의 내적 지배자 an t ar y am i n 라고 한다· 神은 世界의 實體 이며 原因이 댜 실체는 정말로 속성으로 나타나며 원인은 정말로 결과로 나타 나나 兩者는 同一 t ada t m y a 하다고 한다· 또한 內在 samava y a 라는 것 도 발라바에게는 勝論哲 學 에서처럼 關 係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同一性울 뜻한다고 한다· 발라바에 의 하면 幻術 ma y a 이 나 無知 av i dy a 는 神이 자기 자신~ 다양한 세계로 나타내는 힘 sak ti이며, 이렇게 나타난 세계는 결코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라 참 顯 現이라고 한다. 발라바는 세계를 ..!:!.. 라흐만의 假現 v i var t a 으로도 轉愛 p ar il). ama 으로도 보지 않는다. 세 계는 神의 참 현현인 고로 가현이 아니고, 신의 현현은 神에 어떤 변화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전변일 수도 없다고 한다. 세계는 神의 자연스러운 發生으로서 이것을 발라바는 不 俊轉變 avik r ta - pa ril). am a 이라 한다.
발 라바는 特異하게 도 世界 j a ga t와 生死 sams 료ra 를 구별 한다. 세 계는 신의 實在的 顯現이므로 언재나 存續하나, 生死는 우리가 영 혼의 참 본성, 죽 그것이 곧 브라흐만 자체(喜稅만 감추어진)라는 것 을 모르고 영혼을 육체와 同一視하는 無知 때문에 단지 상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無知가 사라지면 生死의 實在나 苦 痛도 사라지는 것이다· 世界(물질과 영혼들)는 브라흐만의 顯現으로 서 質在하 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無知 가운데서 잘못 볼 것 같 으면, 다시 말해 브라흐만과 다른 多樣性의 세계로 볼 때는, 實在하 지 않는 허구인 것이다· 라마누자와 같이 세계의 實在性을 인정하 면서도, 샹카라와 같이 生死의 세계를 無知의 産物로 보는 것이다. 無知에 의하여 묶여진 영혼은 神의 恩籠 pu~ ti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지식만으로는 낮은 구원만 얻을수있을 뿐이며 最 高의 구원은 知識보다도 信愛에 의 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信愛는 모 든 罪를 滅하여 주는 神의 은총에 의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者에게 주어진다고한다. 발라바는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육체에 대 한 苦行이나 世上으로부터의 도피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댜 神의 은총에 의하여 最高의 구원을 얻은 者는 解脫이라기보다 는 크리 슈나神과 함께 하늘의 낙원 브린다바나 V pi davana 에서 그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遊戱에 同參한다고 한다. 5 차이타니야 系統의 베단타哲學 발라바와 同時代에 東印度의 벵갈 地方에 차이타니야 Cait an y a (14 85~1533) 라는 聖子가 나타나 열렬한 크리슈나神의 信仰運動을 展開 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크리슈나의 化身으로 추앙한다. 차이 • 타니 야는 어 떤 著述도 남기 지 않았으나 그의 思想은 루과 R iipa와 사 나타나 Sanata n a, 그리 고 그의 조카인 지 바 Ji va 에 의 하여 계 승되 고 발전되었다. 지바는 특히 차이타니야派의 가장 좋은 敎理書로 간주되 는 『六編 ~a tsa_ mdarbha 』을 저 술했 다. 18 세 기 초에 와서 는 발 라데 바 비 댜브후사나 Baladeva V i dy abhu~na 라는 哲學者가 나와서 이 敎派를 위 한 『브라흐마經』의 주석 서 『고빈 다疏 Gov i nda-bh~ ya』
륭 써서 哲學的인 깊이를 제공했다. 이 學派에서는 브라흐만은 곧 세계의 主인 크리슈나神이다· 神은 ‘ 여 러 가지 힘 sak ti을 동하여 作用하며 자기 자신을 物質과 靈魂들로 나타낸다· 神의 힘 가운데는 우선 그의 內的, 本質的 힘 anta r ail ga svarup a -sakti 혹은: 그의 識力 c it -sak ti이 있 다· 이 힘 은 그의 세 가 지 성 질 , 즉 存在 sat, 識 cit, 喜'. • IQ ananda 에 따 라서 세 가지 힘 으 로서 作用한다· 자신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存在하게 하는 힘 samdh i n 냐 ak ti, 자신과 他存在둘로 하여 금 認識을 갖게 하는 힘 sa 펴 vit -sa kti , 그리고. 자신과 他存在둘로 하여금 喜 脫을 느끼게 하는 힘 hlad i n i -sak ti이 다· 神은 다음으로 內的 • 外的인 中間的인 힘 t a t as t ha-sak ti으로서 靈 魂力 ji va-sak ti을 갖고 있 다· 그는 이 힘 에 의 하여 자신을 個別的 露魂 ji va 둘로 나타낸다고 한다. 이렇게 나타난 영혼들은 자신의 神 的인 본성을 忘却하고 外界에다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때로는 神을 추구하기도 한다· 神은 또한 그의 外的인 힘 bahir a ng a -sakti 혹은 幻術力 may a - sak ti에 의하여 자신을 物質的 p rakr ti인 세계로 나타낸다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 神은 世界의 能動因이며 동시에 質料因이다. 뿐만 아 니 라 이 힘에 의하여 神은 자신을 時間, 業, 그리고 知와 無知 등 울 일으키는 모든 것으로 나타낸다고 한다· 世界는 이러한 能力울 지닌 神의 영원한 遊戱 1 i툐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물질세계와 개인영혼은 神의 힘의 顯現으로서 다 實 在하는 것이나 동시에 神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논 것이다. 따라서 神과 그들과의 관계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神 秘한 關係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챠이타니야 계몽의 哲學 的 立場을 不可思議 差別無差別論 Ac i n ty a-bhedabheda-vada 이 라 부른 다· 個別的 靈魂들과 神과의 관계는 태양빛과 태양 혹은 불꽃과 불과 의 관계로서 이해되며 개인영혼들은 神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解脫이란 이 점을 깨닫고 神울 믿고 의지하는 信愛 bhak ti에 의하여 주어진다. 信愛는 인간이 神과 合一되어 神으로 充滿하거T:
되는 憶憶境을 가져오 는 사랑 p reman 의 극치로 이끈다. 차이타니야 派에 있어서는 이 러한 사랑의 극치는 『바가바타 푸라나 Bh ag a vata - p ura i:i a 』 등에 그려져 있는 牧意 go p a la 크리슈나에 대한 목동들의 아 내들 go p i, 特히 라다 Radha 의 열렬한 사랑에 있어서 理想的 으르 나 타나 있다. 라다는 동시에 크리슈나의 創造力 fa k ti울 나타내는 原 理로서 이해되며 크리슈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不可思 議差 別 無差 別의 관계를 아루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현 Bbandarkar, R. C., Vais n avis m , Slzaiv i s m , a11d Mi no r Relig iou s Sects . Str a ssburg, 1913. Bose, R. , tra ns. , Vedii nt a - P i iri j iitii-S aurabha of Ni m b iirk a and Ve- dii nt a - Ko11.0 t1 1 . b lz a of Sr111iv i i sa : Comme11ta r ie s on the Bralzma-sutr a s. 3 vols. Calcutt a, 1940 -19 43. Gbate , V. S. , The Vedanta : A St u dy of the Brahma-Sutr a s with the Bhasya s of Sankara, Ramanuja , Ni m barka, Madhva and Va/l ab ha. Poona, 1926. Glasenap p, H. v. , Madhvas Phil o sop h ie des Vis h nu G/ au bens, mi t eil ler Ei nl eit un g uber Madhva und sein e Schute . Bonn, 1923. , Die Lebre Vallabbacary a s, Zeit sc hrif t fiir Indolog ie u nd Iranis t i k 9 (1934) . Gonda, J., Vis n uis m and Siv a is m : A Comp a ris o n. London, 1970. Kapo o r, O. B. L. , The Phil o sop h y and Reli gion of Sri C ait an y a . Delhi, 1971 . Kennedy , M. T., The Cait an y a Moveme 퍄 Ox for d, 1925. Lott , E. , Vedant ic A p proa ches to God. London, 1980. Marfa tia, M. I. , The Phil o sop h y of Va//abhii cii r y a . Delhi, 1967. Mait ra , S. K., Madhva Log ic. Calcutt a, 1936. Mi sh ra, U., Vedanta School of Ni m b iirk a (1940). Rag b avendracbar, H. N., Dvait a Phil o sop/ zy and its Place in tlz e Ve- danta . My s ore, 1941 . Rao, P. N., EP ist e m o/o gy of Dvait a Vedanta . Wheato n , 1972.
Rao, S. S., tra ns., The Blzag a vad-Gi tii iuith Sri-M adhviic ii r y a 's Bha- $Yas. Madras, 1906. , tra ns., The Vedii ut a - St7 tra s wi th the Commenta ry of Sri- Madlwi iclz ii ry a . Madras, 1904, Sarma, N. , Tlze Reig n of Reali sm in India n Phil o sop hy : Exp os it i()'/1 of Ten works by Madlzva. Madras, 1937. Sharma, B. N. K., The Phil o sop hy of Sri Madhvii cii r y a . Bombay , 1962. , A Hi st o r y of Dvait a Sc/z o o! of Vedanta and its Lit er atu re. 2 vols. Bombay, 1960 -19 61 . , Tlze Bra!z m a-Sft tra s and the ir Prin c ipa l Commenta r ie s . 3 vols. Bombay, 1971-1977. Sia u ve, S. La Doctr i n e de Madhva: Dvait a Vedanta . Pondic b erry , 1968. Vaid y a , C. M., Slzri Vallabhacarya and Hi s Teachin g s . Kap a dwanj, 1959.
제 20 장 쉬바派의 哲學 1 쉬바派 哲學의 宗敎的 背景 우리는 前 章 에서 라마누자의 이후에 전개된 비슈누派 계통의 베 단타哲 學 을 살펴보았으며 이미 그 宗敎的 배경도 서술한 일이 있 다. 바록 쉬바派의 思想家들은 우파니샤드나 『브라흐마經』 등의 해 석을 통한 베단타哲學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자연히 베 단타思想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의 信仰的 立場을 哲學的으로 정리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6 세기경에 南印度의 타밀地方에서 詩人聖子둘을 중 심으로 하여 전개된 쉬파派의 신앙운동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쉬바神을 숭배하는 者둘이 베다的인 전동 밖에서 하나의 別途의 敎派를 이룬 것은 이보다도 더 이전의 일이다· 우리는 『마하바라 타』나 푸라나 등에서 이미 파슈파타 Pasu p a t as 라고 불리는 쉬파派 의 一派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파슈파타〉라는 말은 문자 그대 로는 〈家畜의 主몰 따르는 者들〉이 라는 뜻으로, 〈家畜의 主〉란 쉬 바神의 여러 이름중의 하나였다. 이 敎派는 人間올 家畜 p asu 에, 그 리 고 神울 그 主人 p a ti으로 비 유하며 , 인간을 無知한 執着의 끈(索 繩, p asa) 에 의하여 世界에 묶여 있는 촌재로 이해한다. 인생의 목 적은 神에 의하여 이 끈으로부터 解放되어 解脫을 얻는 것이라 한 다·
『바유 푸라나 V iiy u- p ur 죠 na 』 나 『아타르바쉬 라스 우파니 샤드 At h ar- vasir a s U p an i ~ad 』 라는 쉬 파派에 의 하여 만들어 진 후기 우파니 샤드에 의할 것 같으면 파슈파타들은 몸에다 재를 뿌리고 심한 苦行윤 하며 파슈파타 요가 P ii su p a t a- y o g a 라는 膜想을 했 다고 할다· 또한 파슈파 타들 가운데는 쉬바神의 化身으로 간주되는 라쿠리 Laku li라고 불리 는 3 세기 경의 인물의 가르침과 수행을 따르는 分派도 있었다. 이 들은 라쿨리 샤 파슈파타 Lakuli sa Pasu p a t as 라고 불리 었다· 파슈파타派와 그 밖의 쉬 바派둘은 자기 들의 종교적 敎 理와 修 行 등을 規定하는 28 개의 아가마 A g amas 라는 문헌들을 산출했으며, 이 아가마들은 비슈누派의 삼히타 Samh it as 와 神의 創造的 能力 sak ti 급 별도의 女神으로 숭배 하는 삭타 Sak t as 派의 탄트라 Tan t ra 와 더 불어 中世 印度의 敎派的 哲學들의 종교적 배경을 형성하는 문헌들이 되 었다. 아가마들은 보통 知識部, 諭伽部, 祭 事 部, 行作部의 四部로 구성되어 있으나 반드시 지켜지는 구분은 아니다· 그 중에서 물론 哲學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知識部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 도 결코 어떤 統一된 體系룰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特히 문제 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바 神과 人間의 個別的 靈 魂과 世界와의 關係 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쉬바派의 學派들은 비슈누派의 베단타哲學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 각기 異見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계 쉬바派의 哲學體系둘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14 세 기 의 베 단타哲學者 마다바 M ii dhava 의 『全哲學綱要 Sarvadar- sana- 책 m g raha 』는 당시의 哲學體系를 모두 16 개로 다루고 있는 가운 데서, 쉬파派의 철학체계로서 4 개를 다루고 있다. 죽 나쿨리샤 과 슈과라 Nakuli sa Pasup a ta 체 계 , 샤이 바체 계 Saiv a --d a rsana, 프라티 아 비 즈나 Pra ty abh ijii료 혹은 再認識 체 계 , 그리 고 라세 슈바 라 Rasesvara 혹은 水銀派 체계이다· 이 중에서 나쿨리샤 파슈파타派는 이미 언급 한대로 파슈파타派의 一分派로서 苦行과 요가의 실천을 주로 하는 敎 派였으며 哲學的으로는 그리 활발했 던 것 같지 는 않다· 이 學派의 學 說울 闇明하는 저서로서는 10 세기 말의 브하사르바즈나 Bhasarvaji ia 의 『가나 카리카 Gana-k ii r i ka 』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브하사르
바즈나는 正 理哲學 의 처술들도 했으므로 이 敎 派와 正理哲 學 사아 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6~7 세기의 正理 哲學 者 웃됴다카라 Udd y o t akara 도 역시 파슈파타 派 의 지도자로 전해지고 있 으며 勝論哲學 의 프라샤스타파다 Prasas t a pada 도 쉬 바 神 의 숭배 자였 다. 아마도 쉬바 派 의 學者 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哲 學 的인 근거를 마 련함 에 있어서 勝論 과 正 理 哲 學 의 이론을 採用하였던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水銀派 는 一 種 의 鍊金術 alchemy 學 派로서 最高 神과의 合一 pa ra- mesvara- t ad 죠t m y a 을 추구함에 있 어 서 水 銀 으로 만든 鍊 金 術 液 eli xir 을 마심으로써 순수한 神的 肉 體 d i v ya - t anu 를 얻어서 요가를 통한 解脫 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이 學 派 역시 哲 學 的인 思想에 있어 서는 활 발한 이론을 전개한 것 같지는 않다· 마다바가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두 學 派, 죽 샤이바 競 系와 再認 識體 系는 반면에 상당한 體 系的 理 論 을 지 닌 學 派로서 좀더 상세 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샤이바 싯단타의 哲學 샤이 바 體 系 Sa i va-darsana 는 주로 아가마 .Ag amas 의 哲 學 을 지 칭 하 는 것으로서 南印 度 의 타밀語롤 말하는 쉬바派인 샤이바 싯단타 Sa i va-s i ddhan t a 派에 의 하여 敎理的 體 系를 이 룩했 다. 이 敎派의 歷 史的 背 景 은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가 있다. 〈샤이바 싯단타〉라는 말은 〈 쉬바派의 完成된 敎理 體 系〉라는 뜻이며 이 派에다가 처음으 로 敎理的 體 系를 제 공해 준 사람은 13 세 기 의 마이 칸다 Me yka~9a 라 는 슈드라階級 출신의 哲 學 者였다. 타밀語로 된 그의 『쉬바智의 登 恒 S i va jii ana-bodha 』은 12 節 kar ik죠 s 로 된 간략한 作品으로서 『라우라 바 아가마 Raurava-a g ama 』의 一部分에 근거 하고 있 다· 그의 思想은 아풀난디 (Arulnand i, 13 세기), 우마파티 (Um ap a ti , 14 세기)등에 의하여 발전됐다. 前者는 『쉬 바츠나나 싯 디 S i va j五 ana-s i ddh i』, 後者는 『쉬 바 프라카샤 s i va- p rakasa 』라는 著 書 를 썼다· 샤이바 싯단타는 3 개의 영원한 實 體로서 그들의 종교적 세계관
을 설 명 한다. 즉 主人 p a ti과 家畜 p asu 과 索 繩 p asa 으로 상칭 되 는 神과 個人露魂과 個人靈魂을 속박하는 非精神 物 a cit아 다· 神은 여 덟 가지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죽 自存, 淸淨, 智慧 , 무 한한 知性, 모든 속박들로부터의 自由, 무한한 恩 龍 , 權能, 그리고 무한한 喜 稅이다. 그는 全知全能하고 無所不在하며 세계물 창조하 고, 보호하고 파괴하는, 그리고 영혼들을 혼미하게 하며, 해방시키 기도 하는 5 가지의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는 세계의 能動因으로 서 그의 힘 sak ti을 手段因 ins tr u menta l cause 으로 하여 위 의 다섯 가 지 활동을 한다· 이 힘은 신의 본질적인 면으로서, 의식이 있고 불 변하며 영원한 에너지이다· 또한 신은 세계의 質料因이 되는 마야 m a.y a 라 부르는 물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야는 그의 힘 sak ti과는 달리 그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개 인의 영 혼들은 가축이 라 부른다. 왜 냐하면 그들은 가축과 같이 無知 av i dy a 의 끈에 의하여 이 세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영혼들 은 창조되 지 않은 영 원한 존재 들이 다. 영 혼은 순수識 ci nma t ra 으로 서 비록 細身이나 鹿身과 연합해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영혼은 욕망과 생각과 행위의 기능을 가지며 過在的이다. 영혼의 數는 늘지도 않고 중지도 않는다고 한다. 영혼을 속박하는 索繩과 같은 非精神物 혹은 不淨物 mala 에는 三 種이 있 다고 한다. 죽 無知 av i d y a 와 業 karma 과 마야 m a.y a 이 다. 無 知는 시작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 공통된 것이다. 無知는 純粹識으 로서의 過在的인 영혼을 지식과 힘에 있어서 有限하고 육체에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無知는 아나바말라 ai:i a va-mala, 죽· 미세한 不淨物이라고 부른다. 영혼의 거짓된 微細 性 ai;i. u t va 혹은 原子性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無知가 다 픔아닌 속박된 영 혼 p asu 의 속박성 p asu t va 을 이 룬다고 한다· 영 혼 을 속박하는 두번째 不淨物인 業 karma 은 영 혼의 행 위 에 의 하여 산 출된다. 업은 미세하므로 보이지 않고 adr~ta 영혼과 육제믈 결합시 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業 自體가 자동적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神의 의지에 따라서 業報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세번 째로, 마야 m a.y a 라는 不淨物온 세계의 質料因으로서 그것으로부터
물질세계가 전개되어 나온다 . 이상과 같은 세 가지 不淨物 가운데서 어느 것에 의하여 묶였는가에 따라서 영혼들은 세 部類로 나뉜다고 말한다· 어떤 영혼은 미세한 부정물 a 1_1 ava-mala 만에 의하여, 어떤 것 은 미세한 부정물과 업의 부정물 karma 1_1 a-mala 에 의하여, 또 어떤 영혼은세 가지 不淨物모두에 의하여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 샤이바 싯단타에 의하면 세 가지 속박의 원리들 自體는 상키야哲學의 프라 크르티 p rakr ti처럼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혼과의 관계는 잠정적이기에 영혼은 그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이 解放을 얻기 위하여는 이 세 가지 不淨物 mala 을 제거해 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神의 恩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다. 신은 모든 영혼이 그를 알기몰 원하기 때문에, 그의 은총은 모 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단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해방된 영혼들은 쉬바神과 하나가 되어 그의 영광과 위대함을 함께 한다. 영혼의 個體性은 남아 있지만, 희열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마치 소금이 물에 녹으면 물과 같이 過在하는 것처럼, 영혼들도 神과 같이 편재한다고 한다. 전에 언급한 세계의 창조활동 등과 같은 神의 다섯 가지 기능은 쉬 바神만의 것아지만, 영혼들은 神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 영혼의 본래적 성품 svarU p a-lak !J a 1_1 a 이 란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박된 영혼은 자신을 물질과 동일시하며, 해방된 영혼은 자신을 神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샤이바 싯단타의 哲學온 주로 타밀 詩人聖者둘의 신앙적 전동과 아가마 .Ag ama 의 사상에 근거 하여 형 성 된 철 학이 다· 그러 나 쉬 바派 의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敎派的인 전통을 정동 베다의 전 동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哲 學者로서 슈리칸타 Sr i ka 1_1t ha 를 둘 수 있다· 그의 연대는 정확히 알 려지지 않았으나 14 세기의 人物로 추정된다· 그는 쉬바信仰의 立場 에 서서 『브라흐마經』의 주석서인 『샤이바疏 Sa i va-bha !Jy a 』를 썼으 며 그의 주석 은 16 세 기 의 아파야 딕 쉬 타 Ap pa y a Di k 춘it a 에 의 하여 또 다시 주석되었다· 이들의 베단타 해석은 대체로 샤이바 싯단타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라마누자의 限定不二論 V i s i~t adva it a 과 매우 흡사하다· 3 再認識派의 哲學 샤이바 싯단타派가 南印度에 근거를 둔 쉬파派임에 반하여 再認 識派는 북쪽 카쉬미르地方에서 전개된 쉬바派의 哲學이었다. 14 세 기 초엽부터 카쉬미르地方이 이슬람敎로 改宗되게 됨에 따라서 再 認識派도 일 찌 기 그 세 력 을 상실 하게 되 었 다· 再認識 Pra ty abh ijii a 派 의 이름은 個人露魂이 자신을 쉬바神으로 다시 認識함으로써 구원 울 얻게 된다는 敎理에서 생긴 이름이다. 再認識派의 창시 자는 9 세 기 경 의 인물로 추정 되 는 바스굽타 Vasu- g u pt a 로서, 傳統에 의하면 그는 쉬바神에 의하여 꿈에 계시를 받아 히말라야山의 마하데바峰에 있는 돌 위에 새겨진 『쉬바經 S i va-s iit ra 』 을 발견하여 이 敎派의 敎說의 根本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스 판다 카리카 Sp anda-kar i ka 』라는 저서를 썼다· 이 學派는 다른 이름 으로는 〈스판다論 Sp anda-sas t ra 〉이 라고도 불린다. 神의 振動 spa n da 에 의하여 多樣한 현상세계가 나타난다는 아론에 근거한 이품인 것 이다. 혹은 쉬바神과 그의 힘 sak ti과 영혼의 세 원리몰 취한다 하여 三體論 T ri ka 이라고도 불린다· 바스굽타 이후 소마난다 (Somananda, 9 세기)의 『쉬바知見 S i va -d r~ ti』, 웃트팔라(Utp ala, 10 세기)의 『再認識 經 Pra ty ab hij五죠-s iit ra 』, 아비 나바굽타 (Abh i nava gupt a, 11 세기)의 『最 上義精要 Param 記 ha-sara 』' 크세마라자 (K~emara j a, 11 세기)의 Ii'쉬바 經省察 s i vasu t ra-v im ars i n i』 등에 의 하여 再認識論의 哲學은 완성 되 게 되었다. 샤이바 싯단타와는 달리 再認識派는 강한 一元論的인 哲學을 전 개했다· 그러나 不二論的베단타와는 달리 이 學派는 多樣性의 世 界를 단지 우리 의 主觀的 無知의 所産으로 보지 않고 神의 思惟의 客觀化된 實在로 본다. 반복되는 세계의 주기적 변화는 神의 意識 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神은 人間과마찬가지로깨어남, 깨어 있음, 참들음, 잠의 네 상태를 順次的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름
아닌 우주의 生成, 持綾, 消滅, 休息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 서 神은 世界의 能動因이며 質料因인 것이다· 그의 창조적 활동은 畵幅이나 물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畵家의 창작적 활동과 비 슷하다고 한다. 神온 그의 本質的인 여 러 힘 들 sak ti울 통하여 活動한다· 識力 cit- sakti , 喜稅力 ananda-sakti , 意志力 icc ha-sakti , 知力 jiian a-sakti , 行 爲力 kr iy a-sak ti과 같은 힘 들이 다· 그는 또한 마야 m a.y a 라는 힘 으로 써 無限한 精神인 自 身을 有限하고 原子的인 個別的 精神 p uru!)a 으 로 나타나게끔 한다. 이상과 같은 힘들에 의하여 個人靈魂들과 多 樣한 現象世界, 主觀과 客觀의 세계가 나타나나 사실은 神만이 唯 一한 宜在이 며 多樣性은 神의 思惟로서 神을 떠 나 別途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事物 들이 거울에 나타나는 것처럼 神은 세계를 自身 안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再認識哲學은 多樣한 世界의 顯現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키야哲學 의 25 原理에 다 11 原理를 추가하여 모두 36 原理 t a tt va 를 수립 한다. 萬物의 根源인 最高神 쉬바를 第一原理로 하여 36 번째의 原理인 地 까지의 展開룰 論하는 것이다. 解脫온 個人靈魂으로 하여금 자신을 獨立的이고 個體的인 것으로 誤認시키고 神과의 同一性을 은폐하는 無知를 제거해야만 가능하 다· 無知의 除去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神의 恩籠으로써 그의 特 殊한 힘 sak ti이 信者에 게 下降 sak ti n ip a t a 하여 그를 사로잡아야만 한다고 한다. 이러한 힘에 의하여 영혼은 神과 본질적으로 하나됨 을 再認識하며 모든 除限性과 差別性은 사라지 는 것 이 다. 再認識을 획 득한 사람은 生存時에 이 미 神과 同等해 지 는 Siv a tu ly a 해 탈을 얻 으며 死後에는 個人性을 영원히 초월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문현 Baer, E., tra ns., Gelzeim nis des Wi ed ererkenntn i s . Zuric h , 1926. Bhatt , N. R. Rauravag a ma, Vol. 1, Intr o ducti on : Les ag a ma i;iva ites pa r J. Fil lioz at. Pondic h erry , 1961 .
Chatt er ji, J. C., Kashmi r Slzaiv i s m . Srin a g a r, 1914. Mahadevan, T. M. P., Tlze Idea of God in Saiv a-Sid d hii nt a (19 55). Matt he ws, G. , Si va j1 1anabodham of Meyk auda (Hl48) . Pandey, K. C., Ablrin a vag u p ta, an Hi st o ric a l and Phil o sop h ic a l St u dy. Benares, 1935. Paranjo t i , V., Saiv a Si dd hii ut a . London, 1954. Pil lai, G. S., lntr od ucti 011 and Hi st o ry of S/z a iv a Sid dhii 11t a. Anna-malai, 1948. Ponnia h , V. , The Saiv a Si dd lza11ta Theory of Knowledg e . Annamal- ain a ga r, 1952. ~astr i, S. S. S., tra ns., The Si vi id v ait a of Sr i ka 깐 ha. Madras, 1930. Schomerus, H. W., De r Shaiv a-Sid d hii nt a . Leip z ig , 1912.
제 1V 부 現代의 印度思想
제 21 장 現代印度思想의 歷史的 背景 1 이슬람과 힌두교 굽타왕조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던 인도의 고전문화는 굽타왕조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후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외적으 로는 인도의 문화가 중국과 티벳,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수출되었으며, 내적으로는 인도의 사회제도와 종교적 전통들이 더 공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굽타왕조의 몰락 으로 인하여 인도는 남과 북에 많은 地域的인 王國들이 分立하게 되었으며, 수백년 동안 끊임없는 대립과 정치적 혼란의 시기로 들 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印度에 정치적인 동일과 질서를 가 져 온 것은 인도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回敎徒들이었다. 서력기원 632 년 에 모하멧 Muhammad 이 죽은 후 곧 시 작된 이 슬람교의 정 치 적, 종교적 팽창은 삽시간에 中東지방울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은 동쪽으로 팽창하여 中國 국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약 10 세기 末부터는 터키族의 회교도들은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 인도를 공략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13 세기부터는 北印度의 대부분이 회 교도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고, 1~] 기에는 데칸지방에 回敎王 國이 세워졌다. 16 세기에는 아크바르 (Akbar, 1556~1605) 의 征服에 의 하여 남쪽 끝을 계외한 인도의 대부분은 회교계국인 무굴 Mu gh ul
帝國의 支配하에 들어갔으며, 무굴제국의 정치적인 힘은 아우랑챕 (Aurang z eb, 1658~1707) 의 때에 이르러 극치 에 달했다· 그러 나 아우 랑쳅이 죽은 후 무굴계국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와 더불어 서구라파 諸國의 세력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18 세기 중엽에는 영국은 이미 印度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발판을 굳 혔으며, 19 세기 초에는 全印度를 統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도는 13 세기부터 1947 년에 정치적 독립을 되찾을 때까지 약 700 여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 이슬람은 그 성격상 강한 非采協的인 宗敎였으므로 힌두교와의 同化를 보이지 않았으며, 많은 힌두교도들이 이슬람에 改宗하기~ 하였으나 힌두교 그 자체는 이슬람의 오랜 정치적 지배에도 불구하 고 비교적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지속되었다· · 우선 數的으로 보아서 회교신자는 劣勢였고 힌두교의 社會的 基盤을 이루고 있는 캐스트 cas t e 制度는 여전히 혼들림이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이 슬람에 改宗된 사람들까지도 이 제도플 여전히 준수했던 것이다. 분만 아니 라 수많은 詩人聖者들에 의 하여 主導된 信仰 bbakti 運動 은 中世印度의 全域을 휩쓸면서 힌두교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신적 위로와 안정을 계공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힌두思想家둘은 이슬람의 순수하고 엄격한 唯一神신앙의 영향을 받아 多神敎的 힌두교의 改革과 더불 어 이슬람과의 융화를 꾀하는 종교적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러 한 운동을 대 표하는 자로서 카비 르 (Kab ir, 1380~1460) 와 나 낙 (Nanak, 1469~1538) 을 들 수 있 다. 카비르는 베나레스출신으로서 힌두교의 오랜 신앙적 전동을 이어 받았다· 그는 비 슈누의 化身 avata r a 라마 Rama 만을 神으로 섬 기 는 苦行者둘의 敎團울 창시한 라마난다 Ramananda 의 재자였다· 그러나 카비르는 힌두교의 不二論的 哲學과 이슬람의 唯一神사상과의 결합 을 괴하였으며 스스로를 라마神과 알라 Allah 의 자식 이 라 불렀다. 그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독단과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神은 오직 한 분분이며 그의 많은 이름들은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 했다· 그에게는 神像崇拜나 神殿이 나 이슬람의 모스크 mos q ue 나 모 .
두 神을 어떤 場所에 제한시키려는 그릇된 것으로서 神은 둘이냐 건물에 관계없이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스스로폴 알 린다고 한다. 카비르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儀式主義뭉 배척하고 聖스러운 자면 누구든지 가까이 했다. 카비르의 思想은 나낙 Nanak 에 의하여 더욱더 발전되었다. 나낙 은 힌두교와 이슬람으로부터 缺別하고 힌두교신자와 회교신자를 망 라하여 하나의 神을 섬기도록 하는 씨크스 S i khs( 〈弟子들〉이라는 뜻) 라 불리는 새로운 종교 교단을 창설했다 . 씨크敎의 思想은 주로 힌두교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이슬람의 엄격한 唯一神仰을 강조하며 神像숭배를 배척했다. 나낙의 死後 씨크敎徒들은 讚碩둘을 수집하 여 그란트 Gran t h( 〈책〉이라는 뜻)라는 聖典을 만들어 그들의 禮拜의 중심을 삼았다. 한편 무굴帝國의 수립 이후 이슬람敎內에서도 그 강한 非采協性
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와의 融化몰 괴하는 자유로운 사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굴王朝의 第四代王 샤 자한 Shah J ahan 의 長男 다라 쉬코 (Dara Shik o h, 1615~1659) 였다· 그는 아크바 르 이래 대대로 내려오는 무굴王들의 종교적 寬容性울 이어받아 이 슬람과 힌두교의 融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슬람敎의 神秘主義인 수피 즘 Su fi sm 의 영 향 아래 힌두교의 神秘主義, 特히 우 파니샤드의 思想에 心醉하여 兩者의 同一性울 주장하기까지 이르렀 다· 그는 우파니샤드를 순수한 唯一神思想을 가르치는 神의 가장 분명한 啓示로 간주하였으며, 당시의 우파니샤드 文獻 52 點을 수집 하여 梵語로부터 페르시아語로 번역을 할 정도로 우파니샤드를 높 이 평가했다 .1) 그러나 다라 수1 코의 이와 같은 融合的인 태도는 保 守的인 이슬람 지도자들의 反援을 사서 결국 그는 背敎者로 처형 되 었 다· 그의 뒤 를 이 은 그의 동생 아우랑젭 (Aurang ze b, 1658~ 1707) 은 保守的인 순니 Sunn i派의 回敎徒로서 그는 아크바르 이 래 무굴王室의 다분히 折表主義的 傾向에 終止符를 찍 었다.I) 이 번역은 안.:zz.틸 괴 페론 (An q ue til du Perron, 1731~1805) 이라는 붕란서인에 의해 羅典語로 번역되어 〈 Ou p nek'ha t〉라는 이등으로 충판되었으며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울 끼치게 되었다.
2 英國의 統治와 힌두교의 改革運動 이슬람의 지배와는 대조적으로 英國의 인도지배는 힌두社會와 文 化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統治 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왔던 힌두교도들에게 어느 정도 . 의 해방감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의 영향은 이술람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世俗的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경우보 다는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운 편이었다. 예를 들면 영국인들에 의 하여 도입된 英語를 동한 近代式 敎育은 바록 대다수의 힌두교도들 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교육을 받은 소수의 印度 知性人 들에 의하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영국식 교육은 처 음에 오히려 이슬람교 신자들 가운데서 더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이 다· 그리하여 영국의 인도지배는 비록 이슬람의 지배보다 시간적으- .로는 훨싼 더 짧았지만, 인도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보다 더 根本的 인 梨化륭 초래하게 되었다. 영국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法秩序 및 그들이 도입한 근대적인 合理的 敎育은 종래의 바라문들의 주도하 에 이루어진 傳統的 사회질서와 관습에 상충되는 점이 많았으며, 印度人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원리와 價値觀을 제시했던 것이다. 바 라문의 사회 적 特權이 라든가 노예 계 급과 천 민 ou t cas t e, unto uchables. 들에 대한 差別, 여자아이들의 早婚制度, 과부들의 再婚禁止, 사티 계도 sa ti(남편의 죽음과 더불어 부인을 火葬하는 것)들의 비합리성은 영 국인돌에 의하여만 지적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은 소수· 의 힌두 지성인들 자신예 의하여도 自覺되게 되었으며, 이들은 社 會的 不條理몰 개선하려는 改革運動들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또~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더불어 들어온 基督敎의 宣敎師둘은 P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해하기 어 려운 힌두교의 여 러 종교적 현상들 울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다· 힌두교의 多神敎적 신앙과 神像 숭배 와 같은 것은 항시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새로운 교육을 받은 일부 인도의 지성인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 던 것이다. 이재 힌두교 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 現代의 대표적 개혁
운동과 思想的 覺槿울 간략하게 살펴본다. 1 브라흐모 사마쥬 Briih m o Sami ij 이 운동은 1828 년에 람모한 로이 (Rammohan Roy , 1774~1833) 에 의 하여 시작되었다. 람모한 로이는 英國式 敎育을 받은 최초의 힌두 개혁자로 간주되며, 그는 힌두교의 사회적 전통의 개혁분만 아니라 서구식 교육의 확립을 위하여 힘썼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 면 多神敎的 산 앙이 나 神像 숭배 와 같은 當時 힌두교의 모습들은 힌 두교의 본래적인 가르침으로부터 타락한 것이다. 그의 해석에 의하 면 우파니샤드는 唯一神的인 思想울 가르치며, 그는 이것에 의하 여 당시의 힌두교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1815 년에서 1819 년 사이에 벵갈어와 영어로 우파니샤드를 번역했다. 람모한 로이 에 의하여 시작한 〈브라흐모 사마쥬〉의 운동은 그 후 데벤드라나 트타골 (Deven~ana t h Tag o re, 1817~1905) 과 케샵 챤드라 센 (Keshab Chandra Sen, 1838~1884) 등에 의 하여 겨 1 승 발전되 었 다. 有名한 노 벨文學賞 受賞者인 라빈드라나트 타골 (Rab 'i ndrana th Tag o re, 1861~ 1941) 은 데벤드라나트 타골의 아들이 었다. 2 아리 야 사마쥬 Arya Samaj 〈아리야 사마쥬〉운동도 역시 힌두교의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힘 썼으나, 한편으로는 브라호모 사마쥬가 너무 西洋의 가치와 문화를 숭상한다고 비판하면서 종교 교 및 사회개혁의 원리를 베다의 권위에 서 찾으려는 좀더 보수주의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다야 난다 (Da y ananda, 1824~1883) 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베 다는어디까지나 唯一神思想울 가르치며, 신상숭배와캐스트간의 차 별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 힌두교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베다의 원리 에 서서 해야지, 서구라과의 학문이냐 가치를 尺度로 삼아서는 안된 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은 힌두교의 전동에 대한 새로운 프라이드 룰 심어 주었으며, 〈브라흐모 사마쥬〉보다 좀더 大衆的인 改革運動 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兩者 모두 그 운동에 참여한 자의 범위 이상 을 넘어서서 힌두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3 라마크리 슈나 宜敎會 Rii m akris h na Mi ss io n 라마크리슈나 (Ramakr i shna, 1836~1886) 는 벵갈지방에서 출생했다. 그는 벵 갈지 방의 16 세 기 의 聖者 챠이 타니 야 Ca it an y a 와 같이 그 지 방의 바슈누-크리슈나 Vi sn u-Kr§na 신앙의 전동을 이어받은 聖者였 다. 그는 수많은 宗敎的 體驗을 통하여 여러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 나임을 깨달았으며, 또한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철학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도 얻었다. 그는 기독교와 이슬람까지도 공부하였으며, 심지어는 모하엣과 예수의 환상까지도 보았다고 한 다· 그의 사상은 케 샵 챤드라 센 Keshab Chandra Sen 과 비 베 카난다 (Vi ve kananda, 1863~1902) 와 같은 유능한 제 자들에 의 하여 널 리 전 파되게 되었다. 特히 비베카난다는 1893 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국 제 종교회 의 Parlia m ent of Re ligi ons 〉에 서 베 단타철 학에 입 각한 힌 두교의 抱容的 宗敎觀을 소개했으며, 1896 년에는 〈뉴욕 베단타협회 The Vedanta Soc iet y of New York 〉를 창설 했고, 인도에 돌아와서 는 〈라마크라슈나 선교회 Ramakris h na M i ss i on 〉를 창설했다. 〈라마크리 슈나 선교회〉는 인도와 세계 곳곳에다 支部를 발족시켜서, 베단타 철학을 중심으로 한 힌두교의 세계관을 서양에 소개하는 데 큰 공헌 을했다. 4 타골 라빈드라나트 타골 (Rabi ndrana t h Tag o re, 1861~1941) 은 아마도 간디 와 더불어 現代 印度의 가장 偉大한 人物로 간주되는 사상가이다. 1912 년 에 출판된 그의 詩集 『기 탄잘리 G it a fij a li』로서 노벨 文學賞울 수상하면서 그는 現代印度를 대표하는 知性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巡訪하면서 近世의 民族 主義의 狂亂과 物質主義의 惡을 강조하면서 全人類의 精神的 造産 을 일깨웠다· 그는 특히 인도와 아시아의 自身과 世界를 위한 靈的 使命을 강조하면서 西洋의 民族主義的 前轍을 밟지 말 것을 경고했 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印度의 정치적 독립을 원하면서도 국단의 政治一邊倒的인 두쟁방식을 반대했으며 印度의 民族主義믈 비판했 다. 그러기에 그는 간디에 대한 깊은 尊敬心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
제적인 自治의 運動둘을 좁은 民族主義的인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했던 것이다· 타골은 베단타철학의 一元論的 사상을 이어받고 있지만 世界롤 단지 幻術 m a.y a 로 보지는 않는다. 神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며 自然의 신비와 아픔다움을 동하여 우리는 神의 힘을 인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5 간더 간디 (Mohandas K. Gandhi, 1869~1948) 는 인도의 민족주의 자 정 치 가로서 영국의 교육을 받은 변호사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사상적 기반을 예수의 山上 寶 訓이나 돌스토이의 平和主 義 에서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傳統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이 점이 그로 하여금 인 도의 大衆에 막대한 영향력과 호소력을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 그 는 마하트마 Mahatm a 죽 〈위대한 영혼〉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하나의 聖者로까지 추앙받게 되었다· 그는 모든 인도인들에게 自治 swara j라는 이상을 提示했다. 그의 자치의 개념은 단지 정치적인 次 元을 넘어서서 개인의 정신적인 自己修練과 完成까지 의미했다. 간 디는 이러한 정신적인 자기수련의 지침으로써 『바가바드 기타.!]의 행 동주의 적 철 학인 〈카르마 요가 karma- y o ga 〉의 사상을 생 활 속에 실 현하고자 했다 .D 印度의 自治몰 얻기 위한 그의 〈眞理의 抱持 saty a- g raha 〉와 非暴力 ah i msa 의 實錢은 全世界的인 共感을 불러 일으 켰다.
1) M. K. Desai, The Gi ta Accordin g to Gi ind hi (A hmedabad: Navji va n Trust 1956) 참조빽
간디는 타골의 비판에 대하여 자기가 展開한 外國商品의 担否 등 구체적인 自治의 運動둘은 수백만의 굶주린 民衆둘의 人間다운 삶 을 위한 두쟁이라고 옹호하면서 經濟와 倫理, 政治와 宗敎의 不可 分離性을 주장했다· 그는 印度의 民族主義는 排他的이고 侵略的인 것이 아니라 人道主義的인 것이며 印度는 世界를 위하여 죽기 前에 자신이 먼처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 22 장 現代의 印度哲學 1 오로빈도의 哲學 타곱과 간디는 그들의 막대한 사상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哲學 者라기보다는 . 詩人과 政治家,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思想家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印度의 哲學的 傳統을 등에 업고서 그것을 現代的으로 再解釋하는 印度的 現代哲學의 代表的 存在로서 오로빈도와 라다크리쉬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로빈도 (Aurob i n ·d o Ghosh, 1872~1950) 는 간디와 마찬가지로 영국 의 교육을 받은 후 귀국하여 인도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힘썼다· 그 도 역시 『바가바드 기타』의 〈카르마 요가〉思想에 심취하였으나, 나 중에는 직접적인 정치활동에서 물러서서 요가의 修行者로서, . 哲學 者로서 일생을 마쳤다· 그의 사상은 대체로 베단타철학의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인도철학의 주류를 형성하는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철학은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고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브라흐만은 萬有의 동일적인 원리인 一 者 이면서도 현상세계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브라호만은 一 이면서도 多이고, 多이면서도 一인 것이다· 오로빈도에 의할 것 같 으면 佛敎는 一을 무시하고 多만 보았으며, 샹카라의 철학은 多를 무시하고 一만 본 盲點을 갖고 있다고 한다. 순수존재 ·순수의식 • 순수희열 Sa t-cit -ananda 로서의 브라흐만은 순전한 희열 가운데서 일
종의 遊戱 1 i la 로서 스스로를 현상적 세 계 로 나타낸다. 이 世界는 그 의 마술적 인 힘 인 마야 maya 혹 은 삭티 sak ti로서 實在하는 것 이 다· 오로빈도는 브라흐만이 자기 자신을 制限하여 다양한 現 象 世界로 나타내는 힘을 〈수퍼 마인드 Sup e r M i nd 〉라 부른다. 수퍼 마인드는 삿트 • 칫트 • 아난다로서의 브라흐만과 다양한 현상세계와를 매개해 주는, 브라흐만의 자기의식으로서의 힘인 것이다· 브라호만이 수퍼 마인드 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현상세계로 나타내는 과정을 오로 빈 도는 下 降 Descent 혹 은 退 轉 Involu ti on 이 라 부른다. 이 下降의 결 과로 세계는 브라흐만을 은폐하는 베일과 같기도 하나 동시에 세계 안에는 브라흐만이 內在하여 세계는 끊임 없이 靈 的인 進化 Evoluti on 를 추 구하게 된다· 이 진화의 과정을 오로빈도는 上昇 Ascen t이라 부 른 다· 그리하여 물질 ma tt er 에서 생명 life이 진화하고, 생명 lif e 에 서 정신 m i nd 이 진화한다. 인간은 이 下降과 上昇의 과정에서 결정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물질, 생 명 , 정 신분만이 아니 라, 神的인 靈 魂 soul, ps yc he 혹은 自 我 self 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러한 진화과정 속에서 無知를 제거하고 자신에 대한 函 的인 自 1문 을 통하여 물질, 생명, 정신으로서의 중은 自 我 e g o 를 초 월 하여, 수퍼 마인드 Sup e r M i nd 의 무한한 힘과 지식 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수퍼 마인드에 도달하면, 宇宙內에 처음부터 潛在 해 있던 영적인 힘인 삿트 • 칫트 • 아난다는 완전히 드러나고 實 現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의 자기 실현이요, 온 우주의 진화적인 자기실현인 것이다. 인간과 우주가 영적으로 실현된 상태 를 오로빈 도는 神적 인 삶 Divi n e L ife이 라 부르며 , 이 러 한 變 化된 인 간을 靈 知的 存在 Gnosti c Bein g 혹은 超人 Su p erman 이 라 부른다. 그는 이러한 神的인 삶의 궁극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自身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동일적 요가 Inte g r a l Yo g a 라는 修 行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오로빈도에 의하면 초월적 세계의 神的인 삶에 도달한 超人 은 또 다시 下降하여 수퍼 마인드의 빛과 힘을 이 세계에 퍼지게 하 며 모든 存在의 超越化와 聖化를 돕는다고 한다. 오로빈도의 철학은 베단타철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
서구라과의 進化論的인 思想에 영향을 받아, 샹카라의 세계 부정적 인 브라흐만 假現說 Brahmav i var t avada 을 버 리 고 브라흐만 轉變說 Brahma p ar il)죠 mavada 的인 입장에 서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적국적 인 영적 해석을 시도한 철학이라 볼 수 있다. 2 라다크리 쉬 난의 宗敎哲學 라다크리 쉬 난 (Sarve p a lli Radhakri sh nan, 1888~ )은 現代의 살아 g、、 는 印度 知性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그는 비베카난다 Vi v eka- nanda 가 일찌 기 힌두교의 世界競과 宗敎사상을 西洋에 소개 했 던 것 과 같이 베단타哲學에 입각하여 종교의 본질과 의미를 해석하여 t!t 界的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인도의 哲學과 宗敎思想 울 연구하고 소개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풍부한 종교적 多元性을 收容해 온 힌두교의 포용적 정 신을 밑 받침 으로 하는 종교철학을 전개하여 현대에 있어서 종교간의 理解와 對 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다크리쉬난은 수많은 처서들을 통하여 一貫性 있게 宗敎的 獨 斷主義와 世俗的 物質主義의 兩極을 비 판하며 온 인류의 영 적 생 활의 공동성과 통일성을 웅변적으로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종교란 궁극적 으로 하나이 다. 敎理,神學, 制度, 儀式 등 종교의 外的 表 現은 다양하고 서로 많은 차이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內的인 종교적 體驗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한다· 종교의 核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지 敎理냐 神學 과 같은 외적인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 다. 體驗 ex p er i ence 은 종교의 영 혼아 요, 表現 ex p ress i on 은 종교의 육체라고그는 말한다. 宗敎的 體驗이란 우리의 모든 가치들과 경험들을· 통일시켜 주는 것으로서 영원하고 철대적인 實在에 대한 우리의 全人的 추구를 의 미한다. 라다크리쉬난은 종교적 체험의 特性으로서, 첫째로 主客의 분리를 초월한 통일적 의식을 말한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自我 A tm an 의 체험과 같이, 이러한 동일적 의식의 상태에서는 아는 자
knower 와 알 려 진 것 known, 意識 과 存在, 思惟와 質在의 대 립 이 초 월 되며 여러가지 관념들과 감정들의 구별도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 하여 좁은 個人的 自我의 테두리가 普過的 自我에 의하여 무너진다 고 한다. 종교적 체험은 그 自體에 있어서 充足的이고 完全하여 그 의미와 진리와 타당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外部的인 보충~ 필요로 하지 않 는다고 한다. 종교적 체험은 自明性과 確 實 性을 지니고 있 다는 것 이다. 종교적 체험에는 日常生活의 긴장이 사라지고 내적인 平和와 기 쁨이 지배한다고 한다. 종교적 체험은 또한 모든 言語的 表現과 論 理룰 초월한다. 단지 상칭적 표현이나 暗示만이 허용될 따름이다. 이들 표현들은 물론 歷史的 그리고 文化的 特殊性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라다크리쉬난은 말하기 룰 절대적으로 순수한 종교적 체험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종 교적 체험은 어디까지나 어떤 특수한 종교적 傳統 안에서 發生하며 解 釋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의 내용, 죽 대상은 우리 의 모든 해 석 을 초월 하는 至高的인 存在 Su p reme 이 다. 우리 가 그것 을 추상적 이 고 非人格的 i m p ersonal 인 것 으로 체 험 하고 해 석 할 때는 絶對者 Absolu t e 라 부르고, 우리가 그것을 意識과 喜稅의 存在 로 해석할 때는 神 God 이 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實在 the Real 는 人格 p erson 과 非人格 sp iri t 및 모든 해 석 을 초월하는 어 떤 것 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實 在의 초월성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것을어느정도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人間存在의 가장 깊은 것과 類似性을 갖 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한다. 우리의 영혼 soul 혹은 자아 self , s pirit가 이 實 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實 在와의 접촉을 위하여는 우리는 自我 믈 發見하고 實 現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닦아서 自我에 부착되어 있는 異質 的인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特別히 膜想을 自我發見의 길 로 강조하고 있다. 종교의 목표는 修 行울 통하여 자아를 變 化시키 고 온 인류의 삶을 聖化 d i v i n i ze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救援인 것이다.
*참고문헌 Sri Aurobin d o, Essay s on the Gi tii. Calcutt a, 1926-1944, 1950. , The Li fe D i vi n e . 3rd ed. 2 vols. Calcutt a, 1947. , The S y n t lz 函 s of Yog a . Madras, 1948. , The Ideal of Human Unit y. Pondic h erry, 1950. , The M ind of Lfg h t. New York, 1971 . Brute a u, B., Worth y is the World: The Hi n du Phil oso p hy of Sri Aurobin d o. Ruth erfo r d, N. J.,. 1 971. Chaudhuri, H., Sri _ Au robi1 1 do: The Proph e t of Li fe D i vi n e . Calcutt a, 1951. , The Phil o sop hy of I11t eg r ali sm , or, the Meta p hy s ic a l Sy n - the si s Inherent in the Teachin g of Sri At tro bin d o. Calcutt a, 1954. Chaudhuri, H. and F. Sp ieg e lberg, ed. , The Inte g r al Phil o sop hy of Sri Aurobi1 1 do. London, 1960. Desai, M. K., The Gi tii Accardin g to Gandhi. Ahmedabad, 1956. Devaraja , N. K., ed., India n Phil o sop hy Today. Delhi, 1975. Farqu har, J. N., Modern Reli giou s Movements in India . New Delhi, 1977 (Ind ian edit ion ; 1st ed., 1914) Gandhi, M. K., An Auto b io g r aph y : The St o ry of My Exp er im ents with Truth . Bosto n , 1957 (Beacon Pape r back) . Joa d, C. E. M., Cormt er Att ac k From the East, the Phil o sop hy of Radhakris h nan. London, 1933. Mait ra, S. K., An Intr o ducti on to the Phil oso p hy of Sri Aurobin d o. 2nd ed. Benares, 1945. , St u die s in Sri Aurobin d o's Phil o sop hy . Eenares, 1945. , The Meeti ng of East and West in Sri Aurobi1 1 do's Phil o - sop hy . Pondic h erry, 1956. Mi llier , F. M., Ramakris h na: Hi s Li fe a nd Say ing s . 2nd ed. London, 1923. Muir h ead, J. H. and S. Radhakris h nan, ed., Conte m p o rary India n Thoug h t. London, 1936.
Ni kh il a nanda, S., tra ns., The Gospe l of Sri Ramakris h na. New York, i95 2. Ris h abhchand, The Inte g r al Yog a of Sri Aurobin d o. Pondic h erry , 1959. Radhakris h nan, S., East and West in Reli gion . London, 1949. , Easte r n Relig ion s and Weste r n Thoug h t. London, 1940. , The Hi n du View of Li fe. London, 1927. , The Reig n of Reli gi011 in C011t em p or ary Phil o sop hy . London, 1920. , The Et hi c s of Vedanta and its M eta p hy s ic a l Presup po sit ion s. Madras, 1908. , The Phil o sop hy of Rabin d ranath Tag o re. London, 1918. , The Phil o sop hy of the Up an i~ a ds. London, 1935. , Reli gion and Socie ty. 2nd ed. London, 1948. , An Ideali st Vi ew of Li fe. London, 1929. , ed., Intr o ducti on to Mahatm a Gandhi. London, 1939. Schil pp, P. A., The Phil oso p hy of Sarvep al l i Radhakris h nan. New York, 1952. Sharma, D. S., St u die s in the Renais s ance of Hi n duis m in the Ni ne te e nth and Twenti eth Centu rie s . Benares, 1944. Sriv a sta v a, R. S., C011t em p o rary India n Phil o sop hy . Delhi, 1965. Tag o re, R. , Greate r India . Madras, 1921. , Nati on ali sm . New York, 1917.
B 로 T 기 1 印度哲學의 實在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경험되는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과 사 건들 속에서 자기 自身을 잃지 않고 그들 상호간에 어떤 體系나 統 一的 法則울 찾아서 抱撰해 보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적인 知的 요구이다. 이러한 지적 요구는 동시에 얼핏 보기에 無秩 序하고 혼돈된 세계 속에서 삶의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意味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實賤的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듯한 無常하고 有限한 세계 가운데서 그 背後에 어떤 不變하고 無限한 참다운 實在를 찾는 것도 또한 온 인 류가 추구해 온 공통적인 종교적 철학적 관심사였음에 들림없다. 이러한 知的, 實賤的, 宗敎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해 實在觀 Vi ew of Rea lity인 것 이 다. 우리는 이미 本書에서 印度哲學의 다양한 實在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다양한 실재관들을 각 학과의 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 좀더 體系的이고 類型的으로 고찰함으로써 印度哲 學의 全體的인 理解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l) 우선 印度哲學은 다양
1) H. v. Gia s enap p, Di e Phil o sop h ie der Inder (Stu ttga rt : Al fre d Kroner Verlag, 1974), pp, 370/74; N .. Smart , Doctr i n e and Argu ment in India n Phil o sop h y (At la nti c Hig h lands : Humanit ies Press, 1964), pp.1 81~94 참조
한 현상세계의 베후에 있는 궁극적 인 官t E 를 어 떻게 보았는가를 먼 처 정리해 보자. ® 初期의 베다人들은 대체로 다양한 현상세계륭 그대로 받아들 이는 상식적인 세계관을 지녔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계는 여 러 농라운 힘들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믿었고 이 힘들을 人格的인 神으로서 숭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잡다단한 현상세계를 영혼 이나 原初的 物質이나 原子와 같은 몇 가지 存在原理로 환원시켜 이 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베다人들도 後期에 와서는 諸神의 배후에 어떤 統一的인 하나의 實在 tad ekam 가 있음을 생 각하게 되었다. 이 質在 sa t에 대한 추구는 우파니샤드에 와서 本 格的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브 라흐만이라 불렀으며 이 브라흐만을 또한 인간의 본질적 실재인 아 트만과 同一視했다. 同時에 인간의 영원한 본질은 인간의 의식의 탐구를 통하여 純粹識 c it으로 파악되 었다. ® 센鼎 E 는 우파니샤드의 하나의 영원한 實在룰 탐구하는 一元論 的인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세계와 인간을 단지 여러 가지 存在要 素 들, 즉 여러 가지 성질, 상태 혹은 사건들의 復合的 現象으로 파악 하는 一種의 現象主義的인 세계관을 주장했다. 이러한 존재의 요 소들(法)은 결코 獨自性을 지닌 영원한 實體둘이 아니라 기능적으 로 相依相資하며 조건적으로 發生하는 作用이나 힘들로서 간주되었 다. 그러나 佛陀도 이러한 相對的이고 無常한 존재요소들만을 존재 하는 것의 전부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첫째는 이러한 존재요소들이 완전히 消滅된 寂靜한 상태로서 淮葉이라는 어떤 절대적이고 言語 로서 規定하기 어려운 實在를 인정한 것이다. 둘째는 존재요소둡간 의 相互作用과 生滅에는 어떤 一定한 法則性이 있음을 佛陀는 가르. 쳤다· 十二支緣起說과 같은 것이다. 이 緣起法 自體는 어떤 항구적 인 眞理인 것이다. ® 正理와 勝論哲學은 小乘佛敎와 같은 多元的 세계관을 대표하 면서도 佛敎와는 달리 多元的 要素들을 無常한 것들로 보지 않고 영원한 原子들과 이 원자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전 地,水,火, 風으로 본다. 분만 아니 라 時間,空間, 意根 manas 들과 自 我 atm an
들도 영원한 T[ 體로 간주한다. 이러한 宜體들 외에도 性質, 行爲 혹은 運動, 普避性, 特殊性, 內在의 법주들로서 세계를 파악하며 이들 범주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質在의 모습들로 본 것이다. 챠이 나敎는 存在몰 다섯 가지 의 延長的 質體 as ti ka y a 로, 죽 공간, 운동, 정지, 물질, 영혼들로 파악하며 챠로바카의 唯物論的 哲學온 地, 水, 火, 風의 4 요소만을 영원한 實體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마드바의 二元的베단타 철학은 神과 영혼들과 原初的 물질 p rakr ti을 세 가지 영원한 實體로 파악하며, 상키야哲 學은 단지 하나의 통일적인 원초적 물질과 다수의 영혼들만을 영원 한 貸體 라고 주장한다. ® 이상과 같이 세계를 多元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모든 多 元性과 현상세계의 多樣性을 無知 av i dy a 로 인해 나타난 幻術 ma y료 로 보고 하나의 實在에 의하여 세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一元 論的 인 質在觀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이론으로 전개된 것은 大乘佛敎의 哲學과 不二論的 베단타 哲學 에서이다. 우선 中觀哲學에서는 모든 세계의 差別相을 일단 空에 의하여 부정한다. 空이 곧 實在이며 다 몽아닌 열반인 것이다. 그러나 中觀哲學에서는 空이란 현상세계의 根底에 놓여 있는 實體 도 아니며 生死의 세계를 초월하여 있는 어 떤 형이상학적인 質在도 아니다. 生死 自體가 곧 바로 空이며 열반 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種種 의 差別相은 無知의 所産인 幻 術이며 오직 俗諦의 단계에서 假名으로서만 인정될 뿐이다. 唯識哲 學 은 空을 말하면서도 識 vij na na, c itt a 의 轉變을 동하여 假名의 世 界를 說明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대승불교의 實在觀에 영향을 받아 우파니샤드와 『브 라흐마經』을 再解釋하고 철처한 一元論的인 存在論울 전개한 것이 샹카라의 不二論的 베단타철학인 것이다. 여기서는순수한存在 sa t, 識 cit, 喜 脫 ananda 로서 의 브라흐만만이 唯一無二한 實 在이 며 그 이 외 의 個人的 露魂들이 나 差別的 事物 둘은 모두 無知의 영 향아래 나 타나는 幻術 m a.y a 일 뿐이다. 그러나 같이 브라흐만의 唯一한 實在 性울 인정하면서도 라마누자를 중심으로 한 信仰的 베단타 哲學者
둘은 동시에 개인영혼들과 물질의 質在性도 인정하려는 修正된 베 단타철학을 발전시켰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實在觀에서 보고 있는 궁극적인 質在와 현상세계와의 因果관계 내지 存在論的 관계폴 살펴볼 것 같으면 우 리는 다음과 같은 4 種의 理論울 구별할 수 있다. ® 始起說 arambhavada : 이 說은 正理와 勝 論학파에 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세계의 사물들은 영원한 원자들의 結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원자들의 결합에 의하여 원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비로소 生起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果가 因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因中無果論 asa t ka ry avada 울 따르는 것 이 다. ® 轉 變 說 pa ri1_1 .a mavada : 이 說은 數論哲學의 質在觀에 입 각한 것으로서 다양한 현상세계를 어떤 통일적인 근본적 實在의 轉 變 으 로 보는 견해이다. 죽 果는 因의 變化나 發形에 지나지 않으며 因 속에 이미 가능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因中有果論 sa tk ar y avada 을 주 장하는 것이다· 위의 두 立場은 因中有果論과 因中無果論이라는 근본적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현상세계의 원인은 어떤 변하지 않는 영원한 實體임을 말하는데서는일치하고 있다· 그러나佛敎와 不二論的 베단타哲學은 아러한 因果論을 배척한다. 왜냐하면 원인 이 영원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결과도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 공통된 反論이다. 그러나 佛敎와 不二論的베단타는 이러한 비 판으로부터 두 개의 正反對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죽 佛敎 에 의하면 결과가 無常하므로 原因도 無常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不二論的 베단타는 無常하고 다양한 結果는 幻 術에 지 나지 않을 분 전혀 實 在性이 없음울 주장한다 •• 브라흐만이 唯一의 實在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因 果論을 더 추가하게 된다. ® 衆合說 sa m.g坤t avada : 이 說은 佛陀의 근본적 인 가르침 에 근 거한 것으로서 모든 事 物둘은 無常한 諸法의 協力과 和合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며 영원한 實 體 란 此岸의 세계에서는 `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勝論哲學의 原子說과 같이 세계에 대한` 多元的 견해이며 因中無果論을 주장하지만 勝論과는 달리 因의 영 원성이나 實體性을 부정한다. 勝論은 事物의 原因으로서 영원한 원 자적 실 체 ato m i c subs t ance 를 주장하지 만 佛敎는 無常한 원 자적 사 건 ato m i c even t들만을 원 인으로 보는 것 이 다. 영 원한 質體를 부정 하고 anatm an 一切몰 순간적 인 諸法의 衆合과 連紹으로 보는 佛敎의 입장은 人格의 연속성이나 業 報의 현상을 설 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說一切有部에서는 三世質有 法體恒有룰 주장하여 法을 實體化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般若經典 의 空思想이나 龍樹의 中觀哲學은 이러한 경향을 배척하고 諸法의 無自性과 一切皆空울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空이라는 實 在의 세계에서는因果와生滅이란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俗諦의 관 점에서만 인정되는 方便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諭伽行哲學은 實在 를 空으로 보되 다른 한편으로는 識轉變說 v ijii. ana- p ar ii; ama 을 주장 함으로써 數論의 轉變說的인 因果論과 약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 다· 그러 나 물론 識 v ijii. ana 과 物質 p rak rti은 전혀 다른 存在論的 原 理이다. ® 假現說 viv arta v ada : 이것은· 현상세계의 모든 差別性과 다양성 을 無知 때문에 나타나는 幻術로 보며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만이 : 實在임을 주장하는 견해로서 不二論的 베단타철학의 입장이다· 中 親哲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因果論이란 假現으로서의 현상 세 계 에 서 만 타당한 이 론이 며 日 常的 vya vaharik a 眞理의 관점 으로부 터는 인정할 수 있으나 궁극적 p arama 인 진리의 관점에서는 處妄한 세계와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다. 절대 唯一의 實在인 브라흐만은 모든 因果關係를 떠난 實在인 것이다· 그러나 日常的인 진리의 次 . 元에서 볼 것 같으면 현상세계는 어디까지나 브라흐만을 토대로 하 i 여 나타나는 고로 브라흐만을 세계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 러 한 뜻에 서 不二論的 베 단타哲學온 브라흐만假現說 Brahmaviv a rt a- vada 의 因果論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라마누자를 위시한 信仰的 베단타哲學者들은 假現說을 피하고 一種의 轉變說에 接近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f 2 印度人의 傳統的 ·于宙觀 1 힌두교의 宇宙形相誌 cosmog rn p h y 베다에 나타난 우주관에 의하면 우주는 三府構造볼 가진 것으 로 간주됐다. 위로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神둘이 움직이고 활 동하는 하늘이 있고 그 밑에는 새와 구름과 空中의 神둘이 활동하 는 空中圈 an t arnc~a 과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납작하고 둥근 땅이 있다· 그러나 후에 힌두교의 전동적 우주관에 의할 것 같으면 우주 는 이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죽 우주는 週期的인 創造 sr~ ti와 解體 p rala ya 의 과정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영원하고 방대한 體系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수히 많은 세계들 가운데 하 나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브라마神의 卵 Brahma 1_1q a 과 같이 계란 도양을 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모두 21 개의 帶 zone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地球는 그 중에서 위로부터 일곱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地球의 위로는 울라 칼수록 점점 다아름다운 6 개의 天界가 있으며 거기에는 주로 神 · 둘이 거하고 있으며 地球밑으로는 파탈라 Pa ta. la 라 부르는 7 層의 地下世界 neth er world 가 있 어 서 나가 nag a (人面蛇身의 동물) 等의 神話的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 파탈라 밑에는 또 7 層으로 된 地 獄 Naraka, p ur g a t or y이 있 어 아래 로 갈수목 점 점 더 고통스러 운 곳 이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世界는 빈 空間 속에 떠 있으며 다 · 른 세계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한다. 地球의 크기와 모양에 관하여 印度의 天文學者둘은 지구가 球~ 이라고 생각했고 크기까지도 거의 오늘날과 비슷하게 계산했지만, 종교적인 세계관은 베다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을 쫓아 세계를 하냐 의 거대하고 납작한 圓盤으로 생각했다. 지구의 中心에는 須彌山 Sumeru 이 있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이 수미 산의 四方에 바다룰 사이 에 두고 4 개의 大陸 dv ip a 이 있으며 그 가 운데서 南쪽에 있는 것이 所謂 閣浮提 J ambudv ip a 로서 이곳이 人間 들이 사는 곳이며 이 대륙의 남쪽에 히말라야산에 의하여 격리되어 〈바라타子孫둘의 땅 Bharata v arl?a > 죽 印度가 위치해 있다고 믿었다 e
푸라나 Pura i:i a 들에 나타나 있는 宇宙形相誌는 이보다 더 상상적 인 비약을 한다· 그리하여 閣浮提는 須彌山을 둘러싸고 있는 環形 으로 생 각되 었으며 閣浮提는 또한 〈 Plak:;,ad ip a 〉라 불리 는 다른 하나 의 大陸에 의하여 環形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 地球 는 수미산을 中心으로하여 모두 7 重의 環形의 大陸으로 되어 있으 며 대육과 대육 사이에는 각각 소금, 糖, 술, 버터油 gh ee, 밀크, 擬乳,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다. 2 佛敎의 宇宙觀 불교의 우주관에 의 할 것 같으면 온 우주는 欲界 kama-dhatu , 色界 rup a -dhatu , 無色界 ar ilp a-dha t u 의 三界로 되 어 있다. 이 三界는 물 론 生死의 世界 samsara 로서 淮藥을 얻 기 까지 衆生둘이 태 어 나는 곳 이다. 欲界는 色, 聲,香,味, 觸, 法울 지각하는 6 가지 감각기관 을 지닌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그들의 業에 따라서 태어나 게 되는 5 가지의 존재영역 g a ti(五舞)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낮 은 곳에 있는 地獄 naraka 으로부터 시 작하여 峨鬼 pr eta , 畜生 tir- ya g yo ni, 人 manu!jy a , 그리 고 欲界의 멘 위 에 있는 神 kama -d eva 들이 거하는 영역이다. 地獄은 地下에 있으며 어두운 것, 추운 것, 더러 운 것의 三種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8 가지의 程度의 差異가 있다 고 한다. 畜生과 人은 지구의 표면에 거하며 神들은 須彌山의 頂點 위 에 있는 天界 devaloka 에 거 한다. 三十三天 Tr 료y a t r im sa t, 夜摩天 Ya .m a, 究率天 Tu!j ita 등을 포함한 6 개 의 天이 있 다. 欲界의 위 에 는 微細한 물질 로 된 色界 r ilp a-dha t u 가 있 다. 여 기 에
는 味, 香, 觸의 3 감각은 없으나 여기에 거하는 자들은 아직도 形 相 riip a 을 갖고 있 다고 한다. 이 色界는 四段階의 禪定 dh y ana 에 의 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17 개의 天(디具舍論』에 의하면; 上座部에서는 18 개; 玲伽行哲學에서는 16 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色界의 위 에 無色界 aru p adha tu가 있 다· 이 것 은 非物質的인 세 계 로서 여기에는 色과 聲마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신적인 자 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無色界도 역시 禪定에 의하여 들어갈수 있는 세계로서 四無色定의 等級이 있다. 죽 空無邊處 akasananty a,識無邊處 vij iian ananty a , 無所有處 akim cany a , 그리 고 非想非非想處 na i vasam jii anasam jii a 이 다. 色界와 無色界롤 합쳐 서 梵界 Brahmaloka 혹은 梵天이라 부른다. 3 印度哲學 및 政治 • 文化史 年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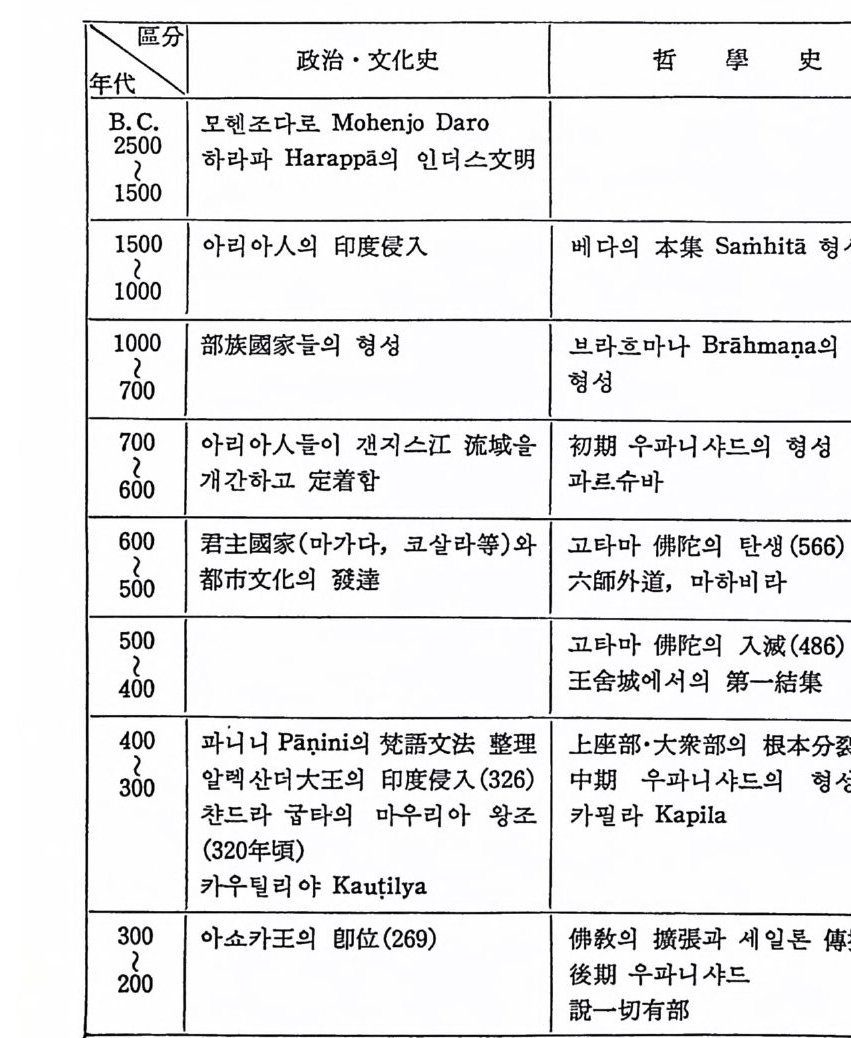 年\ ~I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年\ ~I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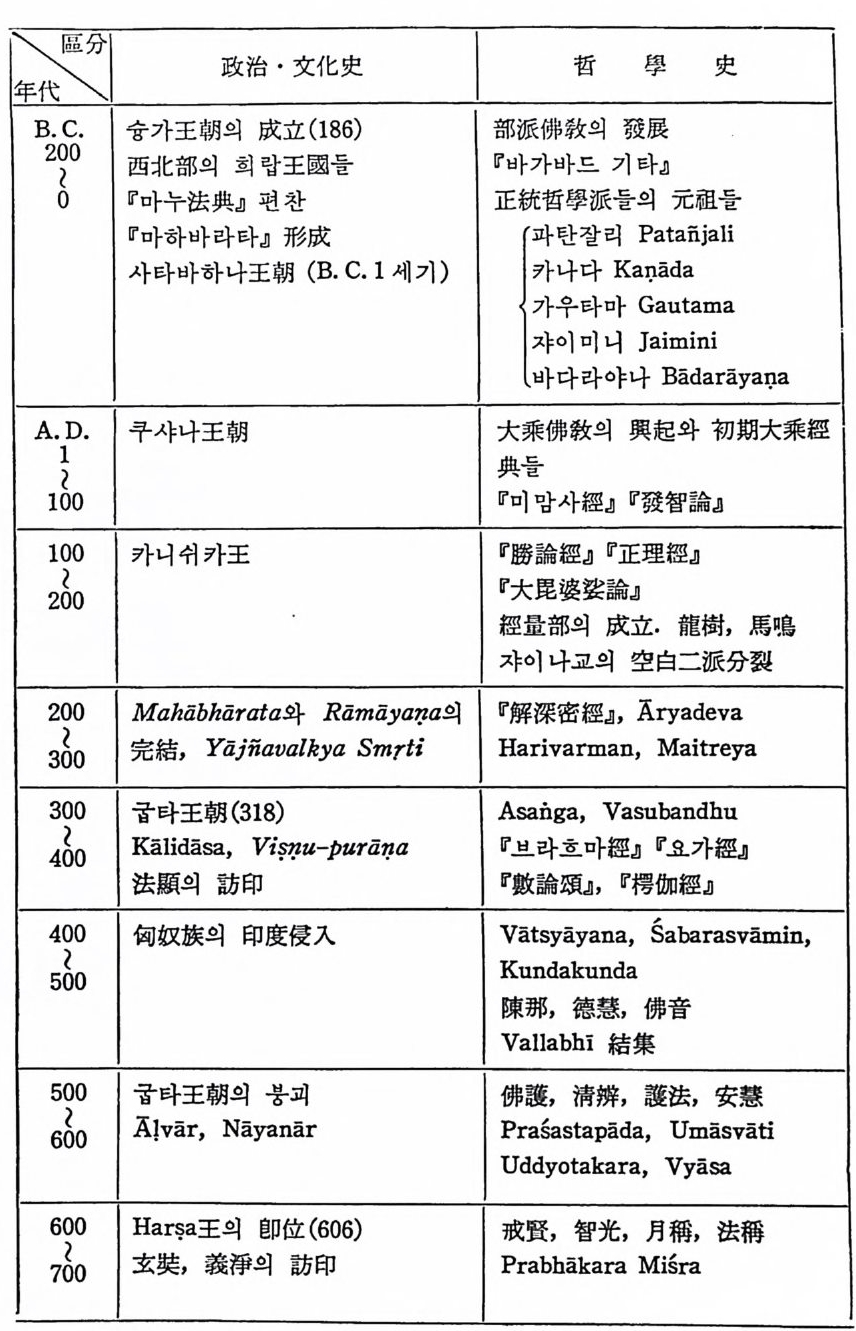 ~I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I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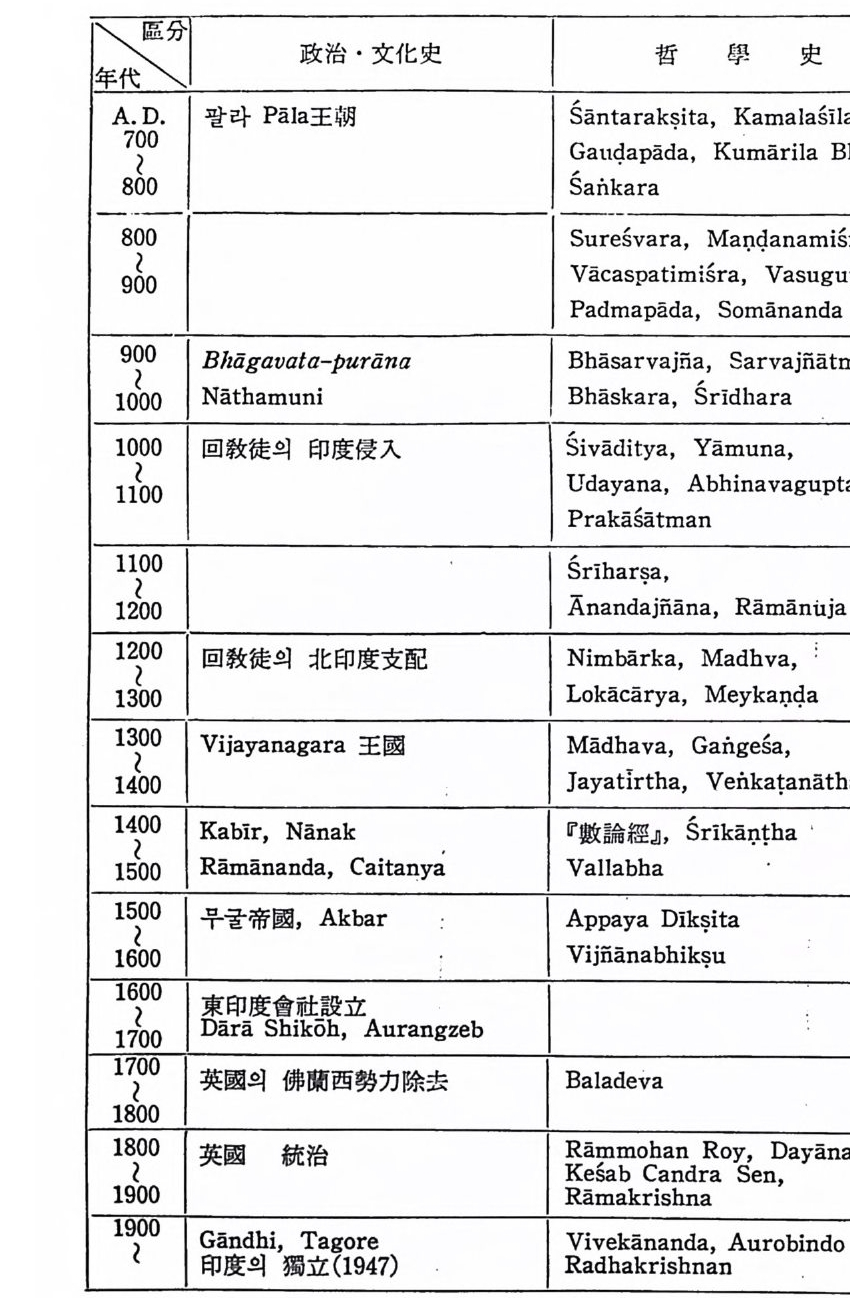 巳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巳 政治·文化史 I 哲 學 史
한글·한자색인
기 가나 카리카 24:z 가루다 80 假名 144, 151, 168 假說(唯識) 163 假說 192 假說的 論破 119, 124 伽耶 53 可 視的 對象 I25 가우다파다 201, 203 가우타마 116 가우타마法典 117 家庭經 86 家畜 241,244 家畜 의 主 241 假託 205 假現 202,204,207,235-6 假現說 35, 96, 269 간게샤 n8 간다라 66,136 간디 256-7 感梵器官 36, 39, 85, no, 120, 127, 184, 194, 208 個物 II2, m6, I92 個別性 37, 226, 232 個人我 41, 127, 200, 206, 208, 210, 222 個人靈魂 40, no, n3, 201, 226, 244, 246-7 個 體 性 III, 245
個體化 99 改革運動 18 客觀 36 客體 163-4,194,231 갠지스 43,50 激情 5I,IOI 見 見分 I72_3 堅慧 70 結 122, 178 結果 96, 101, 129 結果的 狀態 223 結果的 推理 125 結論 122 決定 II8 決定 論 45,56 決定者 100 結 集會議 62 結合 184 經 17,91 經兎部 64, 70-- 'JI , 73, 92, 161, 170 敬拜 205 經驗 104, 128, 184, 204 戒 58,134 界論 야 啓示 12,108,207 戒賢 173 苦 54,58 고빈다琉 237 고빈다과다 201 古事 218
古因明 I74 고타마 53 苦行 49,52-3,94, 185,242 苦行者 230 空 84, 109, IIl-2, 129, 135, 138-9, 144, 146, 151, 158, 165, 189, 202, 231, 267, 269 空間 xo9,n1-2,129,x84,266,270 功過 104, II4, 130, 195 功德 73,133,136-8 空無邊處 74,271 空如來藏 I55 空衣派 50, 180 空七十論 143 果 268 觀 I52 觀念論 I62 觀世音보살 135 觀所緣論 I68 光輝連續 IO8 橋漫 99 敎義正要 I80 敎判 I44, I 九句因論 I74 구루派 I88, I9I 구마라라타 70 也摩羅 付 I43 구마릴 라 브핫따 I69, I88 但舍論 67-8, 70, 160, 173, 271 構成 I7I-2 句身 @
救援論 18, 229 句義 Io8 句義法綱要 Io8 具足戒 134 屈 III 굽타 149, 180 窮極的 眞理 206 勸制 IO5 訖辯 II8 歸納 48, 123-5, 177 歸誘法 145 極樂 138 根本識 I63 根本墓 72 金剛經 139 金剛般若經論 158 金剛般若波羅密多經 I38 禁悠 87 禁制 105 期待性 m6 祈 祖 22-3,27 기 리 다라 고스바민 235 記憶 105, II9, 128, 226 基體 72 기 타 81-3,206 기타 義綱要 222 기탄잘리 256 L 나가 270 나낙 252-3
나라야나 79 那羅延天章 219 나란다 149 나야 182 나야나르 221 나이 스카르미 야싯 디 209 나쿨리 샤 파슈파타 242 나타무니 221 난다왕 76 난디 79 難陀 173 男根 79 낮은 브라호만 205-6 , 208, 223 낮은 知識 206 內在 112, 236, 267 內在因 236 內的 感覺器官 36, 110, 120 內的 狀態 223 內的 自我 33, 203 內的 知梵 120 內的 支配者 236 內制者 223 냐야 17, 96, 188, 222 냐야經 17 냐야 니르나야 209 냐야 바이쉬 1 시카 100,117-8 老死 鹿野苑 53 가 論理學 15-6, 107 論母 야 論事 야 -6
論議 n8 論爭 n8 論題 127 論破 II8 論破의 美味 2II 論誌 II8 높은 브라흐만 205-6 , 223 높은 知識 206 -7 늄伽經 I50, I- 6 能動因 114, 129, 205, 223, 232, 234-6,238,244,247 能攝藏 153 能取 I72 니간타 나타풋타 45 님바르카 234 E: 다라 쉬코 253 다르마 I48 多神敎 24-5, :25 2, 254 궁 다야난다 255 多樣性 :2o :2 - 3, :20 7, 237, :24 6 多元 n3, 266-J , 269 多元論 2OI 구 32 多元的 實在論 I85 斷見 7:2 斷滅論 45-6,56 大名辭 I22, I75 大無 發諾 經 I38 大般埋築經 53, 6I, l40 大方廣佛華嚴經 140
大方等如來藏經 I54 大昆婆沙 論 67, 135 對象 39,II2-3,I89,I94,2IO,224 大勢至菩 薩 I35 大乘經典 I7 大乘敎 學 I7 大乘起信 論 I55-6 大乘成 業論 I6o 大 乘 阿昆 達磨集論 I59, I74 大乘二十 論 I43 大乘莊嚴 經論 .I5 8-9 大我 39 大유가 2I9 大前提 47, I77 大主宰者 40,II3 大衆部 73,I53 大智度論 I37, I43 大品般若 I38, I43 댜우스 23 德 IOI 德 慧 I73 데 벤드라나트 타골 255 데칸 50,25I 道 따 道德秩序 巧 完率天 27I 島王統史 62 道行般若經 I32 獨斷主 義 I83,260 獨頭意識 165 積子部 64,72-3
獨存 104 獨存位 49 同分 69 動植 物 34 同一性 176, 178 同 品 定有性 I75 드바파라 유가 2IO 得 @ 等價周 延 關 係 123 2 라가벤드라 야티 230 라다 235,239 라다크리 쉬 난 258, 260 라마난다 252 라마누자 83, 218, 221, 223, 225, 229, 234,241 라마神 252 라마야나 78, 2 18 라마크리슈나 256 라마크리슈나 宣 敎會 256 라빈드라나트 타골 255-6 라세슈바라 242 라우라바 아가마 243 라자그르하 53 라자스 33,96,98-9,224 라쿠리 242 라쿨리 샤 파슈파타 242 락스미 So,233 람모한 로이 2 로카차리야 226
루드라 40, 79, 219 루과 237 르타 23,28 리 그 베 다 22, 24, 27-8, 38 口 마가다 43, 53, 76 마나스 28,99,100,120 마누法典 86-' J, II7 마다바 242-3 마드바 227, 230-31, 233 마두드. 23 마술사 34 마야 202,244,247,259 마우리 아王朝 16, 76, 148-9 마음 33,36 마이칸다 243 마이 트리 우파니 샤드 41 마칼리 고살라 45 마두라 136,234 마하데바 62 마하바라타 16, 40, 78-80, 84, 94, 218-9,230,24I 마하비 라 49,182 摩詞衍 132 마하트마 257 만다나미슈라 189,2IO 만두키 야 우과니 샤드 36, 41, 202 만두키야 카리카 202 萬法唯識 150 萬有內神論 232
만트라 22 말 짜 33 末那識 I52, 164 妄分別 I65 忘想 155-6, 207, 231 妄想自性 I56 T心사 쿡~ 50 滅盡定 69 名 I55 命 @ 命根 @ 命令 188 膜想 49, 79, 87, 102, 129, 200, 207, 226,233,242,261 名色 55 名身 69 命我 5I-2,I8I 모스크 252 母胎 34,95 모하엣 25I 모헨조다로 79 목갈라나 46 목갈리풋다 텃사 64 牧童 2I8-9, 22I, 239 목숨 208 目的 II8 目的論 IOI 無 I44-6,23I 無決定者 IOO 無決定論 56 무굴帝國 251, 253
無記 57 無道德說 45 無得 69 無昆:홉經 160 無明 55-6, 58, 105, 233 無反例 124 無分別的 知梵 I20, I71, I90 無分別智 160 無常 58,7I 無想果 69 無想定 69 無色界 27I 無生物 23 無性 I73 無所得 I46 無所有處 74,272 無神論 39, 92-3, 196, 200 無實體性 I35 無我 54, 56, 58, 73, 155, 169 無我說 I3, 7I, II7, x50 無業論 45 無餘連榮 57 無欲 IOI 無爲 I50 無爲法 66,69,70,72-4,166 無意識 235 無因論者 45' 無自性 I44 無前力 192,200 無條件性 I24 無住處追築 I6o
無知 34, IOI, 103, 163, 195,202,204- 7, 209-210, 217, 222, 235-7, 244, 246,267 無知梵 177 無著 I50,153,159, 161 無表色 68 無表業 68,72 無形相認識論 170 문다카 우파니샤드 소 ! 文身 69 文殊菩薩 135 文章 126 물 33 物質 23, 34, 39, 41, 51, 82, 95, 184, 195,201,219-220,223-4,231, 233-5,259,269 物質世界 40 物質的 要素 109, 120 物質主義 260 미 망사 17, 107, 116, 127, 169, 173, 187-9,191,197,224-5 미 망사經 17, 188-9 彌勒尊子 I50, I58, I6I 彌勒佛 135, 140 微細性 244 미트라 23 未顯現 39,95-' 7 民族主義 256-' 7 믿음 184, 218 密林 書 꾸
1:1 바가바드 기 타 16, 80-81, 84, 197, 202-3,217,221-2,230,258 바가바타티 카 수보디 니 235 바가바타派 80 바가바타 푸라나 218, 230, 235, 239 바가바트 80 바다갈라이 226-- 1 바다라야나 I99 바드라바후 50 婆羅門 16, 26'.'8, 32, 35, 85 바라타族 78,80 바루나 23 바르나아슈라마 86 바르다마나 49 바수데바 7g- -80 바스굽타 246 바유 23,28 바유 푸라나 242 바이샤 27 바이샬리 53,62 바이셰시카 I7 바이셰시카經 I7 바이문다 80,223 바차스파티미슈라 93,95, 103, 117, 209-IO 박카 202 反論 x89 半마가디語 般若 I35,r39,I46
般若經典 269 般若燈論 I43 般若三昧經 I32 般若心經 138, 144 反祭祀主義 76 발라데 바 비 댜브후사나 237 발라바 235,237 발라비 발라크리 쉬 나 밧타 235 • 發智論 67 發越 64 밧샤야나 n6'7 方 傍觀者 IOI 方便 I39,I46 方便心論 I74 排除 171 百論 143 100 法 165 白衣派 50-51, 180 뱌사 94,102 뱌사티르라 230 傾ffil 74, 105, x6o, 164; 166 梵界 272 況神論 34 梵我一如 37,81 範障 108, u2-3, 177 梵天 272 梵行者 87 法界 I54 法大官 77
法無我 156 法法性辨別論 158-9 法相宗 15.1 , 173 法身 136,149,154 法印 55 法 藏 138 法典 86 法集 64 法稱 169,172,174-5,178 法華經 139,142,160-6 r 베나레스 53 베 다 15, 21, 23, 27, 30, 38, 43, 78, 86, 103, 114-5, 130, 187-8, 191, 199- 200, 206-J , 220-21, 226, 230-31, 245,266 베 단타 17, 22, 30, 40, 83, 93, 107, 113, 183, 187-9, 194, 199, 229-30, 260 베단타 파리자타 234 벤카타나타 226 벵갈 237 變形 23,34,194 보다야나 . 222 菩提 133 菩提心 134 菩提流支 I50 菩薩 74, 133, I36, I38-9 菩薩道 I34 布施 133-5 報身 I36 寶 積經 I32
普通知 登 120 普 通 111-2, 121, 171 普過相 121,124-5,171 普 通 性 267 普 通 的 閔 性 I26 普 通 的 周延關係 48, 122-3, 175 普賢菩薩 135 本來的 性品 245 本生 經 134 本生 談 73 本性 82 本性 論 45 本有的 采 當 性 193-4, 196, 231 本 質 的 힘 238 本 集 22, 26, 187-8 뵤마쉬바 Io8 富 II, 49, 87 附加物 208 不等周延關係 I23 部分 III,'13 2 否定 176-8 不淨物 244-5 不正知 IO5 不存 II2, 177, 193 不存聯 關 I23 不存 兎 I90, I92 不增不減經 I54 不知 覺 I93 負處 II8 分析判 斷 I76 分別 64,99
分別說 65 分別瑠伽品 152 分別作用 171, 190 分別的 知登 I20, I7I 分別智 IO4 分別知 105 불 33 不可見力 u3-4, 130 不可 視的 對象 I25 不可思 議 差 別無差別 239 不可思議 差別無差別論 238 不空如來藏 155 佛敎論理學 174-5, 178 · 佛敎認識論 168-9 不法 2I9 不윗轉發 236 不死 따 佛像 I36 不善法 66 佛說 137 佛性論 I53, I6o 不了 義經 151 不二 139, 146 不二論 201-2, 211, 222, 229, 232, 246,252 不二論的 베 단타 34, 96, 127, 195, 203, 207, 209, 212, 217, 221, 256, 258,267-8 佛陀觀 73, 135-6, 139 佛塔 136 佛默跋陀羅 140
佛設 I43 붓디 85, 98-100, 103-4, 230, 234-5, 237,241,245 브라흐마 219-20 브라흐마經 I7, I99-2OI, 2o6, 221-2,230 브라흐만 27~8,32-4,37-8,40,46 IOI, 187, 195,200,203-5 211,220,2 적 ,229,238,259 브라흐마 假現說 204-5, 210, 260, 269 브라흐마經疏 2OI 브라흐마나 22, 26-8, 30, 32, 38-9, 187-8,190 브라흐마 미망사 I88 브라흐모 사마쥬 255 브르티카라 I88 브르하드아라니 야카 우파니 샤드 32, 39, 203, 209 브린 다바나 220, 234, 237 브하己 드 己 고라판차 234 브하마티 20r2IO 브하사르바즈나 n7, 242 브하스카라 234 브핫따派 I69, I88, I92 比紋 II9,I25 比뮬 II4,II9,I90-9I 非無 I44 비바라나 2IO 昆鉢舍那 I52 비 베 카난다 256, 260
非想非非想處 74, 272, 비 슈누 18, 79-80, 149, 219-20, 233 비슈누派 241-2 비슈누 푸라나 218-20 비슈바카르만 꾸 非有 25,33,144 菩兪裁 119, 125, 190-91, 193 非精神界 224 非存在 205, 210-11 비 즈냐나빅 슈 93, 95 비탈라나타 235 非擇滅 74 非擇滅無爲 70 昆婆沙論 67 非暴力 257 人 死 나 四期 86 사나타나 237 四念處 53,64 四大 45,71 사랑 239 思뮬識 164 사르바쥬나아트만 210 사리풋타 46 邪命派 45 사무드라굽타 149 四無色定 271 四無長 73 沙門 44,53,82
沙門果經 44 事物 그 3 四波羅密多 I35, I55 四碩腦 I64 四分說 173 四相 707I 四姓階級 18,27,83,86,148 四聖諦 53-5, 144 四要素 47,84 似因 118 司祭階級 22, 27, 48 사키야 53 思擇 I16 사트바 33,96,99,103,224,226,235 사티재도 254 社會倫理 46, 78, 82-3, 85 산스크리 트 21, 149, 220-21 산자야 벨라티풋타 46 殺生 50,77 삿트 232 三界 64,140,161,168 三段論法 177-8 三隊地 152 三昧 105, 152 三無性 151,165 三分說 172 三相 151 三性 165, 168 三性說 159 三性質 224 三世實有 269
三 乘 I39 三身 說 136, 160 三十三天 27I 32 相 73 三 要素 33, 41, 85, 98, 224 三自性 I55 三藏 52,64 三支作法 I74 三體論 246 삼히타 242 想 54, 66 相 69-7I, I55 商賜羅主 174 常見 72 . 相對性 182-3 相對主 義 I83 相無自性 151, 165 相分 172-3 相紹轉變 72 相應部經典 I6I 上座部 17, 52, 62, 64, 68, 73, 92, 271 常住論 56 상키 야 17, 39, 81, 84-5, 92, 94, 103, I 야 ,195,200,209,222,245,247 상키야碩 I7 上投 III 相互不存 II3 色 54 色界 271 色法 65,69,71,166 索繩 241,244
生 55 生命 34,259 生命體 183, 194 生無自性 151,165 生死 26, 31, 136, 139, 160, 237, 271 生解脫 38,57,208,226 샤바라스바아민 188-9 샤이바疏 245 샤이바體系 242-3 샤이 바 싯 단타派 221, 243, 246 샤 자한 253 샤타바하나 I48 샤타파타 브라흐마나 26-8 삭타派 242 샨타락시 타 II7, I69 샬리 카나타 미슈라 189 샹카라 34, 83, 189, 201, 203, 223, 22; 229, 258 叔事詩 78,108,218,220 普願 138 釋迎牟尼 53, 133-5 釋義 26 善法 66 禪法 94 善財 140 禪 定 74,134,271 說無業 45 說無作 45 說一切有部 17, 63-4, 66, 70, 92, 96, 139,165 攝大乘論 153, 159
攝大乘論釋 I73 聖敎fil II5, II9, 125 聖道支性 74 聲fil 191, 193 聲聞 I39 聖疏 222 聖詩 22I 成唯識論 I73 成自性 156 聖典 221,230 聖智 155-- 6 性質 109, III, 183, 203, 267 性品 83 性向 98, IOI 世間的 空間 I84 世俗的 眞理 206 細身 41, 101, 208, 244 世友 63,70 世親 67, 70, II7, 150, 159-60, 173 가 所甄 II8,I 소마 巧 소마난다 246 消滅 52 小名辭 122, 175, 177 消能 I85 所攝藏 153 所緣 I52 小宇宙 25 小取 I72 小品般若 I38, I68 束總 5I,IO4,2o6,244
屈性 23, I I2, 205 俗諦 146, 2II, 217, 267, 269 碩歌 26-7, 187 受 54-5,66 水 IO9, III 首梧嚴經 I32 手段因 I29,244 수레슈바라 209-IO 數論 67,268 數論經 95 數論.m 93, 104 數論碩疏 93 數論의 解明 94 數論精要 93 數論七十 93 數論解說經 93 수리야 23,28 睦眠 36, 105 須彌山 27,270 水銀派 242-3 수퍼 마인드 259 수피즘 253 隨解說 230 宿命論 55 순니 253 順世派 47 純粹識 36,38,98,101,128,204-5, 225,244,258,266 純粹存在 205, 258 純粹喜脫 258 純淨不二論 236
順中論 I59 숨 25,28,33,36,99,184 쉐샤 80,219 쉬 바 18, 40, 79, 149, 245-6 쉬바經 246 쉬바經省察 246 쉬바아디티야 Io8 쉬바즈나나 싯디 243 쉬바知見 246 쉬바智의 梵世 , 243 쉬바派 242 쉬바프라카샤 243 슈드라 27,32,226,233,243 슈라바스티 53 슈리 80 슈리니바사 234 슈리다라 Io8 슈리 바이쉬나바 22I 슈리칸타 245 슈리하르샤 2II 슈베 타슈바타라 우파니 샤드 34, 38, 40, 79, 81, 92, 202 슈베타켓무 37 술로카 바르티카 I69 슝가 I48 스바탄트리카 I43 스승 87 스물라바드라 50 스판다 카리카 246 習氣 162-3 僧伽 44, 133 가
勝論 67, 69, 107, 177, 185, 195, 236, 243,268-9 勝論經 108, 112 勝盤經 150, 154 勝盤夫人 154 勝義無自性 151, 165 勝義諦 150 時間 109, 111-2, 129, 184, 2l!r 20, 235,266 始起說 268 詩人 22-3,25 詩人聖者 220-21, 245, 252 識 54-5, 57, 66, 98, 100, 110, 140 152, 158, 160, 163, 165, 196~, 207,233,236,238,267,269 識力 238,247 識無邊處 74,272 識緣起說 155 識轉變說 269 伸 Ill 神 40, 83, 102, 110, 113-4, 117, 126, 129, 190-91, ' 202, 223-4, 226, 231,234-5,244,271 神像 94, 136, 218, 252-3, 255 信仰 12,83, 136,220,252 信愛 .40 ,217,229,233,235-8 信愛의 요가 81, 226 新因明 174, 178 神的 肉體 243 神的 삶 259 神殿 149, 218, 230, 252
新正理學 I18 神通 12I 實利論 77 實用主義 Il9 貫在 13, 15, 25, 30-32, 35, 37,54,171, 182, 201, 204, 231, 261, 265 實在論 70-'7 1 , 107, n3, 117, 119, 142, 145, 177-8, 195, 211 實體 23, 33, 68, 70, IO9-I2, I83, 2OI, 222,236,269 心 57,65, IO4,I5I-2, I60-6I 尋究 n6, 188-9 心法 69,71 心理器官 99 心不相應行法 69, I66 心性 74 心所法 65,69, 165 心作用 IO5 十力 73 十波羅密 I40 十事 62 十碩 234 十二門論 143 十二支緣起 53,55-J ,1 40,160,266 十住昆婆沙論 I43 十地 I59 十地經 I6o 十地品 I40,I43,I6I 싯달타 53 섯디트라야 222 싸르바주나아트만 209
싸마 베다 22 쌈크세 파샤리 라카 209 雙 64 씨 12 씨크스 253 。 아가마 242-3, 245 我見 IO5, I64 峨鬼 27I 아그니 23-4, 27-8 아나바 말라 244 아난다 232 아난다기리 209 阿難陀 6I 아누브하시야 235 阿頓耶識 73, I50_5I, I56, I59, I63 가 아라야識緣起 I52, I55_6, , I59 阿羅漢 57, 62, 133 아웅난디 243 아르쥬나 8x • 아리스토텔레스 I78 아리아 사마쥬 255 아리 안族 21, 24, 43, 79 我漫 99,I 야 ,224 阿彌陀佛 I32, I36, I38 아비나바굽타 246 阿昆 墨 心論 67 아비달마 I55 阿昆達磨經 I52
阿 昆 達 磨供舍論 67 阿凶佛 I32 아 쇼카 16,62,66,76-7,148 아슈리 93 我愛 I64 아우랑쳅 252-3 아지타 케 사캄 발 라 45 我執 99 아 츄 타프렉샤 230 我 擬 I64 아크바 르 251, 253 아타르 바 베다 22 아타르바쉬 라 스 우 파 니 샤 드 242 아트만 책 , 35 , 37,46,85,161,202 아과야 디쉬 타 245 阿含 經 典 I6o 아함카 라 99, IO4, I64 惡 IOI 安 덧 眼足 m6 安 慧 70, 173 알 라 252 알바 르 22I 알렉 산더 76, I36 앎 I84 愛欲 55 야다바 234 夜摩 天 27I 야무나 22I-2 야주르 베다 22,26 야즈나발커 야法典 37, 86
약함 IOI fil: m8 拉果 I72 抗評擇 169, 174 樣態 222-3 어둠 24 言 語 112, 126, 145- 6 , 17 1 , 191, 207 業 28, 38, 45, 48, 66, 103- 4 , 162, 164, 184-5,194- 5 , ,2 08,223 業感緣 起 論 I52 業報 31, 45, 71-3, 83, 86, 102, 105, 114, 150, 152 , 190-91, 194, 196- 7, 235, 244 業身 52 業 의 物質 51 業 의 所依 209 如 來藏 150, 153- 6 , 15~ 如來 藏經 150 如來藏緣起 150, 156 如 貸論 174 如如 155-6 綠 12 139 • 連結 II2 鍊金術 243 緣 起 55- 7 , 1 44,266 緣 起法 74 緣 起自性 I56 緣 起支性 74 演 擇 125, 177 延 長 I83,I85 連 築 57, 66, 7°-'1 3 , 134-5, 139,
146,155-6, 166,266,271 펀葉經 153 閣 浮提 270-' JI 影 像 I52 英 國 18, 252, 254 었 知的 存在 259 었 魂 13, 26, II0-12, 181, 184, 194-5, 220,223-4,231-2,234-5,238, 242,259,261 函 魂力 238 例 II8, 122 豫 定 說 232 五境 84 五 供意識 165 五根 84 誤難 II8 五大 84, 100 五大 晋 50, 185 오로빈도 258-9 誤誘 II9 五法 I55-6 五分 作 法 174 五 事 62 悟性 IT 五 墓 53-4,57' 야 -5,68-9 五原 理 正要 I80 五元 素 說 28,84 五位 165 五唯 84, 100 五作根 84,99 五 種 의 差別 23I
五知根 84,99 五 越 27I 完全知 49, I8I 外 的 感覺器官 99, 109- ro , 120, 128 外的 힘 238 요가 I7, 39, 78, 93-4, 102-4, I2I, 152,257 요가 經 17, 94-5, 102 요가 經疏 94 요가 精粹綱要 95 요가 評釋 95 요가行 者 79 了別境 識 164 要素 96, 196 了 義經 I5I 欲 界 27I 欲望 n, 24-5, 49, 82-3, 87, 103, no, II4, I20, m8 龍樹 I37, I42,. I4 6, I50, I74, 2@ 우다야나 II7, 2II 우마 79 우마스바티 180, 185 우마파티 243 宇宙 觀 35, 38-9, 270 宇宙形相 誌 2707I 우파니 샤드 x3, 16, 22, 25, 28, 30-32, 34, 38, 56, 82, 84, 92, 101, 155, 187,x99-200,,205,207,217,230, 253,255, 2 58, 2 60,266 運動 III, 184-5, 267
運命 45,56 옷됴다카라 II7, 169, 243 웃타라 미 망사 187-8, 225 옷트팔라 246 顔 134, 136 圓成實相 I5I 圓成實性 I59, I65, I68 元素我 41 原始佛敎 52-3, 70, 73 原因 45, 96, 130, 236 原因的 推理 I25 原子 IO9, III-2, II4, I29, I84, I95, 224,266,269 原子論 II4 圓集要義論 I68 月稱 I43 爲自比症 I22, I75, I77 爲他比量 I22, I75, I77 類 I92 兪 I22,I75,I78 有 25,33,55,I44 -6 ,I5I 구 3I 玲伽師地論 I58-9, I74 玲伽行 I7, I43, I50, I52, I58-9, I65-6 , 269, 27I 類개념 II2 維限經 I54 維摩語 I39 維摩誌所說經 I39 唯名論 7I, III 唯物論 45, 47, 56, II4 有部 68-' 72
唯識 71, 140, 143, 150, 152, 155, 159, 161-2,202,267 唯識無境 162, 168, 170 唯識三十碩 I6o, I62, I73 唯識二十論 160, 162, 173 有神論 8I, 94, IO2, II4 唯心 I40,I43,16I 有餘追盤 57 有爲法 54,65,69,71-3,150 流入 51, 185 唯一神 40,252-3,255 類推 I25 有形相認識論 170 遊戱 21,9 -2 0,238,259 六師外道 44 六波羅密多 134 六入 55 肉體 13,28 六派哲學 17, 30, 92, 187 六篇 237 倫盜 50 輪廻 12, 26, 31, 41, 51-2, 56, 72-3, 82, 85-6 , 102, 104, III, 150, 152, 160,164,206,208,226 律 134 隱쩔藏 153 恩龍 40, 221, 226-J , 233, 236-J , 245, 247 浮行 50 應身 136 意 156
意見 I8I 儀軌 26 意根 28, 39, 84-5, 99, 104, 109, IIO- I2, J2 0, I27-9, I72-3, I8I, I84, 206,208,224,266 義務 JI, 22, 49, 81, 86, 190, 192, 208, 230 疑問 I89 意味論 I26-- 'J 意識 36, 69, I52, I56, I 야, I72, I83-4 疑心 II9 依存性 234 義準危 J9 0, I92 意志力 247 依他起相 I5I 依他起性 I59, I65, I68, I73 疑惑 II8 이몽 33-4 二無我 155-6 異部宗輪論 63 二分說 I74 理性 I2 異熟識 I63 이슈바라 34,102 이 슈바라크리 쉬 나 93, 95, 104 이 슬람 18, 252-3, 256 二元論 39, 83, 93, 113, 200, 222, 230 二元性 202 二元的 베 단타 232, 267 理由 I22, I74
二而不二論 234-35 二諦 146,223 二諦說 206, 212 利他行 133 異品過無性 175 因 122, 174-5, 178,268 人格 23, 30, 261 人空法有 68 因果 23, 48, 56, 268-9 因果論 146 因果性 176, 178 因果律 25,48 인더스文明 79 인드라 23 가 因明學 170, 174 因明入正理論 174 因明正理門論 174 人無我 Is6 印象 104, 120 人施設 64 認識 34, 37, 100, 104-5, n8, 158, 190,193,204· 認識論 15-6,91-2,98,107,168,173 認識의 認識 194 忍辱 I34 因의 三相 175 隣接性 I27 因中無果論 96, 268-9 因中有果論 96, 205, 268 認知 m8-9 一味祖 72, I6I
一乘 I37, I39 一心 I56 一元 論 24-5, 83, 95, 200-201, 203, 206,232,246,257,266 一 者 24,33 一切 種 子 識 I5I 林 模者 87 入門式 87 入法界品 I40 入中 論 I43 x: 自 ~ 83 自己勘 棄 235 自明 224 自 明性 172, 194, 196, 203, 231 慈悲 134,137-8,160 自相 170-'7 1 自性 138, 144 自性 淸淨 心 156 自我 13, 28, 34-6, 109-10, 114, II7 꿀, 120, 127-8, 172-3, 190, 194,196-'7 ,2 03,259-6 1 ,266 自我 意識 84, 99, 128, 172-3, 197, 224,231 自我의 認識 194 自我眞理分別 II7 자야티르타 230 自然 23,25 自由 I2-4 自由思想 43
自在黑 93 自 證 分 I72-3 자취 104 自治 257 作用 I94 殘餘物 226 掌 中 論 I68 在家者 78,85-' 7, t 3 3-5, 148 再認識 I2I, 242, 246 再認識經 246 再認 識 派 246 챠이미니 I88 適 用 I22 寂菌 I69 轉變 163,200,223, 2 35-6,268 轉變 說 35,84,96, 195,260,268-9 前不存 II3 轉識 I64 傳承 그 33 轉 依 I66 全哲 學綱 要 2 꾸 全 體 II2 絶對不存 II3 潮 次的 解放 208 接 觸 IO3 正見 58 正念 58 定 58 靜慮 IO5 正理 107, n6, 1 69, 173, 177-8, 243. 268
正理甘露 23 正理經 II6 正理疏 II6-'J 正理花束 II7 正理裝飾 II7 正理商論 174~5, 178 正理精要 II7 正理色蔡樹 Io8 正理評釋 II7, I69 正理評釋眞意社 II7 正理評釋眞意注解明 II7 正理評釋解柱 I69 正命 58 正明 I74 淨明句論 I43 正法蓮華經 X39 正思 챗 定說 II8,I89 精神 23, 28, 39, 81-2, 95, 219-20, 247,259 正信 I85 正語 58 正業 챗 正定 챗 正精進 58 正知 105 靜止 I84 正智 I85 停止 I85 精進 134 淨土 I36
淨土信仰 I38 整合性 I27 正行 I85 制感 ' IO5 祭祀 21, 23, 26-8, 33, 39, 94 , I92,2I8 祭式 22, 35, 188 祭式行爲 I92 第一原因 56,95 制限 205 制限的 條件 IO9 制限知 18I 提婆 I43 條件 I23 條件主義 182 調息 IO5 祖上 25 存在 158, 205, 210, 236, 238, 267 存在論 34,168 存在聯關 I23 存在要素 54,266 宗 122,175 種 45 種子 72,2,I62-4,x66 綜合判斷 I76, I78 坐法 IO5 主觀 36 主觀的 觀念論 207 呪術 27 主人 241,244 主張 I22
主宰神 205 主宰者 223 主體 37, 51, 71-2, 102, 104, 128, 163- 4,172-3, 194, 196,204,224,231 中 I5I 中間的 힘 238 中觀 17,142,158,267,269 中 道 53, 144-5 中論 142, 144, 146, 173 中名辭 122, 175 中邊分別論 158-9, 173 衆生界 154 衆合說 268 僧 105 證自證分 173 證言 15, 48, 105, II9, 125, 127-8 證人 37, 204, 231-2 知 36,51,210 地 109, III 持戒 134 知登 34, 47, 71, 99, 105, n4, n9-20, 169-'7 0 , 172, 174, 193, 207, 230 智光 143 지나 49-50,53 支婁迎識 I32 指導因 129 知力 247 지바 237 支分 Ix8 知相 I2I
知性 39, 85, 96, 98, 102, 114 知識 31-2, 37, 86, 109, 112-3, 118, 181-2, 184, 194, 196-'7 , 208, 217, 224-5,229 知識篇 22,31,187,207 地獄 270-' JI 知의 요가 81,83 智慧 101,135, 139,146, 154 直觀像 171 直觀的 知識 226 直接知 233 陳那 70, 117, 168, 170, 172, 174-5, 190, 194 振動 246 眞理綱要 I69 眞理燈火解釋 235 眞理如意珠 118 眞理月光 93 眞理의 燈 2II 眞理의 抱持 257 眞理證得經 180, 185 眞理通~ 95 眞理解明 230, 234 眞妄和合 I56 眞如 136,156,165 眞如緣起 156 眞諦 146,150,200,211 進化 96,100,259 進化論 26 質料因 95, 101, 109, 114, 129, 200, 204-5,223,232,234-6 ,2 38,24 4,
247 :,尉岳:論 168, 174 築諦 55 執 持 105 執持 識 I52 執 着 82 * 進 斷 52, 185 差別不 差 別 論 234 差別性 37,203,207,223 讚歌 22 創 造 25,II3,I29,195, 2 18,270 創 造 碩 24-5 創 造 神 195, 206, 219 創 造者 129,232 創 造 主 200 챠르바카 46, 48, z22, 124 챤도기 야 우파니 샤드 32-3, 36 챤드라굽타 50, 76-J , I49 챠이 타니 야 237, 256 天界 27I 天啓 經 86 天性 45 聽 見 I8I 靑 目 143 淸辨 I43 超世間的 空間 I84 超人 259 超自然的 힘 IOI 觸 55
最高神 22, 229, 243 最高我 206,208 최고영혼 IIO 最 上 義精要 246 推論 I5, 47, 99, IOI, I05, II4, II9, I2I, I24, m8, I69, I70-7I, I74, I8I,I9I,I93,207,230 廊身 244 畜生 27I 出 家僧 85, 133, 135 出 家者 87, 134 取 55 超 旨 I27 七句 義論 Io8 七 論 64 75 法 I65 칫츠카 2II 칫트 232 구 카나다 Io8 카니쉬카왕 66 카르마 25,28 카르마 미망사 I88 카르마 요가 82, 197, 257 카링가 77 카말라쉴 라 117, 169 카비르 252-3 카사야 51 카쉬미르. 66-7 카우라바 81
카우릴 리 야 77, II7 카타야니푸트라 67 카타 우파니 샤드 38-40, , 92, 94 카필라 93 칼리 유가 2I9 칼리다사 I49 캐스트制度 252 케샤바캬슈미란 234 케샵 챤드라 센 256 코살라 43,53 쿠마릴 라 브핫따 I88-9, I94, I97, 212 쿠샤나 왕조 66, 132, 148 쿠시나라 53 문다쿤다 180 그란트 253 크리 슈나 79-80, 218-21, 235-9 크리타 유가 219 크샤트리야 27 크셰마라자 246 E 타마스 33,96,98-9,224 타밀 220-21 他心知 I8I 타이티리야 우파니샤드 34 탄트라 242 脫身解脫 208 食 105 탑 74 擇滅 74
擇滅無爲 70 텐갈라이 226 텔루구 234-5 몰스토이 257 동일적 요가 259 退 轉 259 트레타 유가 2I9 特殊 I2I, IT 特殊相 I9I 特殊性 IIO,II2,267 特殊性質 IO9 特殊知登 I20-2I, I24 고 破接的辯證法 2II 과드마과다 209-IC 과르바티 79 과르슈바 50 破邪 145 파슈파타 요가 241-- 2 파쿠다 카차야나 45 파탄찰리 94-5 과탈라 270 과탈리 푸트라 50, 76 파티미슈라 I69 판다바 80 판단 99, 170 판차라트라 2I9 판차수]카 93 판차파디가莊解 209 팔리語 52,64
八識 I 55-6 , I63 80 種好 73 八正道 53, 58, 74 八支요가 4I, IO5 八千碩般若 I38 適計所執相 I5I 週計所執性 I59, I65,I68,I73 這是宗法性 I75 平等倫理 85 平等主 義 76 平衡 헛 勘棄 226 勘棄者 82-3,87 表象 I6I,I70 表徵 I22, I75 푸드갈라 72 푸라나 28,218,220,233,271 푸라나 카사과 44 푸루샤 85,98,101-4,222 푸루숏타마 235 푸르바 미망사 26,187-8 푸샤미트라 숭가 77 푸자儀式 218 風 IO9,III 프라브하카라 미 슈라 I88-9, I94, 196,224 프라상기카 I43 프라샤스타파다 108, 243 프라슈나 우파니샤드 4I 프라챠파티 24, 195 프라카샤아트만 209-10
프라크르티 85, 96-8, ror-2, ro4, 209,222 프라티아비즈나 242 프르티비 23 iO 下降 259 하라파 79 하리 79 下投 III 限定不二 論 222, 232 限定的附加物 206 合 I22 合目的性 ro2 解放 40,97,101, 103-4,128,245 解 深 密 經 150, 152, 158, 174 解 體 96, 103, rr3, 218, 223 解脫 II, 14, 26, 38, 49, 52, 66, 78, 82, 86, 94, 97, 104-5, 114, 128, 185, 197,206-7,238,247 解脫法品 84-5, 92 行 54-5,66,1II 行法 69 行爲 12, 30-31, 104, 109, 111-2, 129, 184,190,197,225,267 行爲力 . 247 行爲者 86 行爲 篇 22,31,187-8 行의 요가 81,83 享受 97, 101 享受者 128
享樂主義 47 說空 70,74 現親莊嚴論 I58 現惡 II4, II9, 190 現象世界 15, 201-2, 204, 208, 212, 222,224,249,259,267 現象主義 266 顯揚聖敎論 I59 賢人 25 玄契 I50 , I73 顯正 145 現貧 105 現行 72 嫌惡 II4, I20 形相 33-4,98, roo, 170,203,205 形式論理學 II6, m8 形而上學 14, 22, 24, 25, 30-31, 92, IO7 慧 58 護法 Ig , I73 火 IO9, III
化身 So, 136, 218, 220, 232, 235, 걱그, 252 華嚴經 140, 142-3 幻 術 34, 40, 202, 204, 209, 217, 222, 226,236--' 7, 267 幻 術師 40 幻術力 238 回敎徒 251,253 懷疑論 46,I22 懷疑 主 義 47,183 廻靜論 143 廻 向 I36 後不存 I13 薰習 72 홍 48 흐름 57,71,161 戱論 145 喜 ffl; 34, 37-8, 54, 197, 225, 233, 236, 238,267 喜脫力 247 힘 184, 236, 238
로마자 색인
A abhava II, 170, 190, 231 abhid b arma 16, 133 Abhid h armakosa-sastr a 67 Abhid h arma-sil tra 152 abhim ana 99 Abhin a vag upta 246 abhin i v e sa 105 Abhis a may a lamkara 158 A ci n ty a-bhed죠 bheda-v 죠 da 238 acit 224, 235 Acy utap r ek~a 230 adanavij iian a 152 adhanna 101, u4, 184, 220 adhvary u 22 adhy as a 205 aq f~ta ll3 ad..rs. t a r th a l25 Adva ita Vedanta 34, 203, 207, 217 advaya tv a 139, 146 ag a ma 230 Ag a ma 242-3, 245 ag ru 109 Ag ni 23 aham brahma asm i 37, 203 ahar i:Ik a r a 84, 99, 104, 164 , 224 ahamvit ti l94, J 97 aaa1hh.,sei. vm t. a usr 꿉ya d ai 7 n7 10,2145 57, 55
Aj ita Kesakambala 45 aji va 183 Aji vi k a 45 aJ.~n ·a- n a 101 akara 98, 170, 203, 205 akankl}a 126 akasa 70,84, 100, 109, 184 akasananty a 271 Akbar· 251 akim caniy a 272 ak iriy av ada 45 A~sap a da 116 Akijo b hy a Buddha 132 aku5cana J J J a!ay a vij iian a 73, 150-51, 159, 163 alambana 15 2 Alambanap a rik ija 168 alchemy 243 Allah 252 alokakasa 184 Klvar 22J Ami 沮 bha Buddha J3 2, J3 6, J3 8 Aanma1 i.,st v료yaur yS a J31 80 1 analyt ica l jud g me nt 176 ananda 34, 38, 54, 197, 225, 232, 236,238, 函 Ananda 61 Anandag iri 209 ananda-sakti 247 ananta -dha rmakam vastu 183 •
anatm a n 13, 54, 150, 269 a1_1 a va-mala 244-5 Andhra 148 amrvacamy a 205, 210-n :an na 33 anta l }. -k ara1_1 a 99 anta r atm a n 203 anta r in driy a II O, 120 anta rya m in 223, 236 a1_ 1u 184, 224 Anubha~y a 235 anubhava II B-9 anumana 15, 47, 99, 101, 105, II4, Il9, I2I, I24, I69, 174, 181, 190, 207,230 anup a labdhi 146, 177, 192-3 a1_1 u t v a 244 Anuvy a khy a na 230 anvaya 123 anvik s ik i x 16 any o ny a bhava x x3 ap 33, 100, 109 ap a rabrahman 205-6, 208, 223 Ap a rasail a 63 ap a ravid y a 206 ap a rok~aji ian a 233 ap a uru~ey a x91 ap a varga 97, 101, 12g ap ob a 171 Ap pa ya Dik ~ it a 245 ap pre hensio n u8
ap r ap ti 69 ap r ati sa rhkhy a -nir o dha 70 ap iirv a 192,200 arambhavada 268 Aral) ya ka 22 Ardhamag a dhi 51 arhat 57, 62, 133 Arju n a 81 arth a n, 49, n2 arth ap a tt i • 190, 192 ar th a p rakas 。 -budd hi u8 Arth a -sastr a 77, n7 Arth a vada 26 Arulnand i 243 ariip a-d hatu 271 Ar yad eva 143 Ar ya Samaj 255 asama-vy apti 123 asaxhji iika -dharma 69 asamj fil-s amap atti 69 asana 105 Asang a I 50, J 59 asankhata -dha mma 66 asat 205,2IO-II asatk a ry av ada 96, 268 asm ita 105 Asoka 148 a_s, rava 51,185 asray a 72, 2IO-II as’ ray a -pa rav rtt i 166 짝 an g a- y o ga 105
A$ta s ahasrik a -p r ajn a pa ram ita- s i i. tra 2,B8 a.S ti ka 15 as ti묘y a 183, 267 Asuri 93 At ha rvasir a s Up a ni$ a d 242 At ha rva Veda 22 atm a -dr$ti 164 atm a -m ana 164 atm a-moha 164 atm a n I3, 28, 34_5, IIO, I20, I27, I55, Ig , I72-3, I90, I94, 202-3, 260,266 값 ma-sneha 164 At ma ta t t va viv e ka n7 ato m ic event 269 ato m ic substa n ce 269 aty a nta b hava n 3 Aurang z eb 252-3 Aurobin d o Ghosh 정 avadhi- jiian a 181 avair ag ya 101 avaksep a na I I I Avalok ites vara 135 avata r a 80,218,220,232,252 avaya v a n8 avi dy a 34, 55, 58, 105, 195, 204-6, 209, 217, 222, 233, 236, 244, 267 av ijiiap ti 72 av ijiiap tirii pa 68 avik rt a -par itJ a ma 236
av1. ,s esa 100 avy a kta 39, 95 B Badaray a 1_1 .a 199 bahir a ng a -sakti 238 Bahusruti ya 63 b 료 h y a- i ndr iy a 120 bahy a -kara1_1. a 99 Bakka 202 Baladeva Vi dy a bhii ~a na 237 Balakr~1_1 .a Bhatt a 235 bandha 51 Bara1_1. a si 53 Benares 53 Bhaddaya nik a 63 Bhadrabahu 50 Bhadray a niy a 63 Bhag a vad Gi ta 16, Bo, 203 Bhag a vat 80 Bhag a vata 80 Bhag a vata - pu ra1_1. a 218, 239 Bhag av ata - ti ka -subodhin i 235 bhakti 40, 217-8, 233, 235-6, 238, 252 bhakti -yo g a 81, 226 Bhamati 209-10 Bharata 78 Bharata v ar~a 270 Bhartr p r ap a ii ca 234 Bhasarvaji ia n7, 242
Bhaskara 234 bha~y a 91 Bhatt a I88, I9I-2 bhava 55 bhava 45,231 Bhavaviv e ka 143 bhedabheda 234 bhog a 97, 101 bhog a -sadhana 194 bhog a y a ta n a 194 bhog ya- vi~ a y a 194 bhoktr : 128, 184, 224 bhii ta 100, 120 bhu t축t man 41 bij a 12, 72 Bodhay a na 222 bod hi 133 bodhic ittot p a da 134 Bo dhisa tt va 74, 133, 139 Brahma 80, 219 brahmacari n 87 Brabmaloka 272 Brahma-mi m amsa 188 Brahman 22, 27, 32, 195, 200, 203, 205 Brahma1_1 a 27, 86 Brahma 1_1 a( 베 다) 16, 22, 27, 87, 188 Brahma1_1 ga 270 Brahmap a ri1_1 a mavada 204, 260 Brahma-pr akara 233 Brabma-sutr a 17, 199
Brahmasii tra- bha~y a 201 Brahmaviv arta v ada 204, 260, 269 Brahmo Samaj 255 Brhadara1_ 1ya ka Up an i~ a d 32, 203 Brhasp a ti 23 Brhati I89 Buddhabhadra 140 Buddhapa li ta 143 Buddhavacana 137 budd hi 39,98, 100 buddhi- v rtt i IOO c Cait an y a 237, 256 Ca itika 63 ca itta 69 Candrag upta 50, 76, 149 Candrak irt i 143 Carv a.1떠 46, 122, 124 caste 252 Catu }:isa ta ka 143 ceta s ik a 65-0 cbala 118 Cbandag arika 63 Cbandog ya Up ani~a d 32 cinm atr a 244 cit 36, 98, 100, no, 128, 161, 197, 203, 205, 225, 232, 236, 238, 265 -? cit-s akti 238, 247 Cit su kha 211 citta 57, 65, 69, 104, 140, 160- 01 , 267
citta- matr a ta 140 cit ta-vipr ayu k ta - sarhskara ·59 cit ta- vrtt i-n ir o dha 105 clai rv oy a nce 函 comp ariso n n9, 125 conju n cti on n2 course 24 D dana 133-5 Dara Shik o h 253 dar 요 na 5I,I83 dasabhii mi I 59 Dasasloki 234 Day a nanda 255 Descent 259 desig n er io 2 deva 23 devaloka 271 devaya n a 38,208 Devendanath Tag o re 255 Dhammag uttika 63 Dhammasa ilga n i 64 dhammav ijay a 77 Dhammutt ar ik a 63 瞬 r 狩 5 IO5 dharma n, 49, 54, 77, 81-2, 86, 1011 II4,I48,I83-4,I90 Dharmadhannata v ibh ang a 158 Dharmag uptak a 63 Dhannkara 138
dharmakay a x3 6 Dharmakir t i 169, 174 dharma-lak~ai:i. a 55 dharmamahamatr a 77 D.h a rmapa Ia I43, I73 Dharma S’ astr a 86 Dharma Sii tra 86 dharm in 183 Dharmott ar lya 63 Dhatu k ath a 64 dhruva-smrti 226 dhy a na 94,105,135,226,271 Diga mbara 50 Dign ag a 70, 117 Dl p av 꼬 hsa 62 di5 IO9 Divi n e Lif e 259 Divyap r abandhain 221 divya -t a n u 234 Dvaa fumi k료y a-§5s tr a I43 dravy a 68,109,111,183 drav ya ta 112 dr~!anta 118 dr.s..g r th a I25 dul} kh a 54 Dva itad va ita- vada 235 Dva ita Vedanta 232 Dvap a ra Yug a 219
dv~a 105 Dy au s 23E ekanta v ada 183 Ekavy a vaharik a 6 ,~ ekay a na 137,139 eli xir 243 enjo y me nt 97 Evoluti on 259 exp er ie n ce 260 exp r essio n · 260 F fac to r s of exis t e n ce 54 fai t h I2 G ga mana III Gana-kar i k 료 242 Gandhara 66, 136 Gand hi 257 Gang e5 a m8 Garug a Bo ga ti 平 Gaug ap a d a 93, 201, 203 Gauta m a n6 Gauta m adharma-sii tra 117 Gaya 53 Gi ri d h ara Gosvam in 235 Git aii jal i 256 Git art h a samg r aha 222 Gnosti c Bein g 259
go pa la 218, 221, 239 go p i 22I, 239 Gota m a 53 Go vin d a-bha~y a 237 Gov i nda p줍da 201 gra haka-akara 172 gra hy a -akara 172 Granth 253 grh asth a 87 Grhy a Sii tra 86 gui:ia 83, 96, III, 183, 196, 203, 205 Gui:i am ati 70, 173 Gup ta 149 gur u 87 Guru 188, 191 H Haim avata 63 Harapp a 79 Hari 79 Has ta vala p rakar 킥 1a 168 hetu I22-3,I74 betu vidy a 170, 174 betv ab basa n8 Hind u ism 18 Hi n aya na 132 bladin 'i- s akti 238 hotr 22 Hume 48 Hy mn of Creati on 24
I i cch 료 II4 i ccb 료 -sak ti 247 ide ati on 162 .iimd e pa rt ei osns i-.oo nn lsy 16135 2 lndo-Europ ean 21 Indra 23 ind ri ya 39, 99, 208 infer ence n9 inh erence 112 inst r ume nta l cause 129 Inte g ral Yog a 259 Involuti on 259 Isvara 34, 102, no, 195, 205, 222 Isvara lqs na 93,IO4 J jagat 237 Jaimini 제 8 jal pa xx8 Jam budv ipa 270 jarii.-m aI'a l},a 55 Jat a k a 73, 134 jat i 55, m8, m6, I92 Jay afirtha 230 Jina 49,53 jiva 5I, x8I, I83, 200, 2IO, 224, 232, 235,237 ji꿉tma n 33, no, 127, 206
j·-iva nmukti 38, 57, 208, 226 jiva -sakti 238 jivit a 69 jfian a 31, 51, 101, n8, 184, 194, 21c, 217,225 jiian a-in driy a 99 Jfian a-kal_l. 9 a 22, 31, 86, 187, 207, 225 jfian a-lak!ia l_ l. a 121 J五 ana p rabha 143 Jfian ap ra sth a na-sastr a 67 J.n~ a-n a-,s akti 247 jfiat r 184, 194, 224 iney a 194 K Kabir 252 Kail iisa 79 kaiv a lya 49, 104 kii m a 11, 49 툐 ma-deva 271 kii ma -dhii tu 271 Kamalasil a 117, 16<:> Kal). iida 108 Kanil? k a 66 Kap ila 93 툐 la 109, 184, 219 Kal i d 료 sa 149 Ka ling a 77 Kali Yug a 219 kalpa 219
kalpa na 171-2 karai;i a 96 karai;i a- avasth a 223 Karik a -sap tat i 158 karma 12, 25, 66, 1 n, 129 karma-asray a 209 karma-in driy a 99 Karma-k a i;i ga 22, 31, 86, 187, 225 karma-kartr - vir o dha 197 Karma-mi m ari lsa 188 karma i;ia- mala 245 kkaarrmmaa--ps, au r di-gr aa l a 525 1 karma-yo g a 81-2, 197, 257 kartr 184, 224 karun 료 134 kary a 96,129 kary a -anumana 176 karya -avasth a 223 ka~ay a 51 Kasmi ra 66-7 Kassap ika 63 Kasap iya 63 Kath a Up a ni~ a d 3 8 Kath a vatt hu 64 Katy a y a nip utra 67 Kaukkhuti ka 63 Kaurava 81 Kauti lya 77, 117 Kesavakasmi ri n 234 Keshab Candra Sen 255-6
kevala-jii ii.na 49, 181 kevali n 183 Kha1_ 1qa na-khaI_ lqa -khii. d y a 2n Ki ra I_l ii.v ali J08 klesa ID5, 160 Kosala 43, 53 kramamukti 208 kr iy료 194 kri yii.-s akti 247 krodha 51 Kr~1_1 a 79- 8 0, 218, 221 Krta Yug a 퍄 k~ii. n ti 134 K~atr iya 27, 86 K~emarii.j a 246 k~it i 100 Kumii .ra ji va 143 Kumi i.ra lii.t a 70 Kumii .ri l a Bhat..i a 169, 212 Kunda Kunda 180 Kuruk~etr a 78 kusala-dhamma 66 Ku 휴 na 66, I32, I48 Kusin ii. ri i. 53 L lak~ai;i a 70 Lak~mi 80, 233 Lakuli 242 Lakulis a Pasup atas 242 Lankavata r a-sii tra 150
lila 219,238,259 llim.n . gg aa s, am7-9r, a1 224, I1,7 I5O I life 259 lobha 엇 Lokacary a 226 lokakasa 18 4 Lokay ata 47 Lokot tar avadin 6~ M Mii .d hava 242 Madhva 227, 230 mady a m ii. pr ati pa d 144 Madhy a makii. va tii .ra 143 M 첵 dh y a mi ka 17 Madhyi i.nt a v ibh ii. ga 158 Mag h ada 43,53,76 Mahabharata 16, 40, 78, 218 mahat- a tm a n 39 Mahii. d eva 62 Mahii. pa ri nib b ana-sutt a 53, 61 mahii. pu ru!ja 73 Mahasamg h ik a 62, 63 Mahasth a mapr ii. pta 135 mahat 98 Mahatm a 257 Mahavaip u lya - buddha-avata m saka- sutr a 140 M 꼬vi bha~-sas t ra 67 Mahavir a 49, 182
mahavrata 50 Mahay a na 132-3 Mahay an a-samg r aha 159 Mahay a nasii tral arhkara 158 mahay uga 219 Mahe’s vara 40, 113 Mahir h sasaka 63 Mahis a saka 63 Mait re y a 158 Mait rey a Buddha 13 5 Mait re y a nath a 150 Mait ri Up a ni~ a d 41 majo r ter m 122 Makkhali Gosa.l a 45 mala 244-5 mana 51 manal,l pa ry ay a -ji ian a . 181 manana 129, 164 manas 13, 28, 33, 36, 39, 84-5, 99, IO4, IO9-IIO,I20,I27-8,I52, X56, I 야, I72-3, I8I, I84, 2o6, 208,224,266 manasa-p r aty ak ~a 172 Manavadharma-s’ astr a 86, 117 Ma1_1 c).a nami sr a 189, 210 Ma1_ 1c).iikya -kari ka 202 Ma1_ 1c).iikya U pa n i훈 ad 36, 41, 202 Maii. jus ri 135 Mano-viji i.an a 152, 156, 1 야, I72 mantr a 22, 26 Maruts 23
Math i i ra 136, 234 mati 函 matr k a 64 matt er 259 Maurya 76, 148 m 阜 34, 40, 5r, 202, 204, 209, 217, 222, 226, 235-6, 244, 247, 257, 259,267 ma y죠 -sak ti 238 may in 34, 40 menta l dis p o s it ion 98 menta l sensati on 172 Mey k a1_1 9 a 243 mi dd le ter m 122 Mi mam.sa 17, u6, 127, 169, 173, 187- 9 Mi m ath s anukrama1_1 i 189 Mim amsa-sii tra 17, r88 mind 259 mino r ter m 122 mi tya- -jii an a 129 Mitra 23 mode 183 Mog ga li putta Tis s a 64 Mog ga lana 46 Mohenjo Daro 79 mok 뿐 II, 49, 78, 207 Mok 닿 adharma- p arvan 84 mosg ue 252 Mug h ul 251 Muhammad 25r
mukhy a -p r ai:i a 208 mi ilam adhy a maka-kari ka 142 Mui: iga ka U p an i훈 ad 41 N nag a 270 Nag a rju n a 137, 142 Nai~ karmy a -sid d hi 209 na1vasam.1.~ n-an a-sa m.1.~ n a- 272 Nakulis a Pasup ata 242 Nalanda 149 naman 33, 155 namariip a 34, 55, 204 Nanak 252-3 nanatv a 203 Nanda 76, 173 Nandi 79 naraka 27 白 I Nara~a 79 Nara~'iy a 219 nasti ka 15 Nath a muni mI natt hika vada 45 Navy a-n y aya u8 naya 182 Naya nar 221 neth e r world 270 neti -ne ti 37, 205 ney artha I nibb ana 66 nididh y a sana 129, 233
nid r a 105 nig a mana 122 Ni ga i;i tha Nata pu tt a 45 nig rah a-sth a na n8 nil; tsr ey a sa 197, 207 nil; lsv abhava 145 N i m 悼 rka 234 nmi itta 155 nim itta- karai;i a 125 nir a kara-vada 170 nir gui;iab rahman 205 nirjar a 52, 185 ni rm 무 kay a i:3 6 nin;iay a n8 nir o dha 57 nirod ha-samap atti 69 nirvai ;ia 57 nir vika lpa -jii an a • 160 n i坦rt ha I5I my am a IO5 niyati 55-6 Ny aya 17, 107, n6, 188 N yay a-bha 챕ya n6 Ny ayab hii! jai; i a n7 Ny ayab in d u 174 Ny ayak andali 108 Ny ayak : us umaii jali n7 Ny ayan in ;iay a 209 N 戶ya sara II7 Ny ayasu dha 230 Ny aya-s ii tra 17, u6
Ny a ya -vartt ika u7, 169 N y료y avar tti ka-t하tp ar y a ti ka u 7 Ny ay a vartt ika -ta t p a rya ti ka - pa ris u ddhi u7 Ny a ya -Vais e ~ik a 100 。 outc a ste 254 P pa da II2, m6 pa dart ha 108, n2-3, 177, 231 Padarth a -dharma-samg ra ha 108 Padmapa da 209-10 pak ~a 122, 175 Pakudha Kaccay a na 45 . Pali 64 pa ii ca- bheda 231 pa ii ca -kosa 34 pa ii ca -mahavrata 갭 5 Pa n. ca p죠 d i ka 209 Paiic ap a dik a -viv a ral). a 209 Paii ca ratr a 219 Paii ca sik a . 93 Pa iica sti ka y a sara 180 Pandava So pa n-en-th eis m 232 Panja b 21 pa ratm a n no rarabrahman 205-6, 223 i:,a ramarth a 206
Paramarth a -sara 246 pa ramarth a -s a ty a 146, 150 pa ramatm an 206 pa ramesvara-ta d atm y a 243 daram ita 134 pa rarth a -anumana 122, 175, 177 pa rata n tr a -lakl)a i:i a 151 pa rata n tr a satt a- bhava 234 pa rata n tr a -svabhava 159, 165 pa ravid y a 206-7 pa rik a lpi ta- svabhava 159, 165 pa rii:i am a 163, 194, 235-6 pa ni:i am ana 137 pa rii:i am avada 35, 96, 268 pa rin i l )pa nna-l a kl)a i:i a 151 p ar i n il)p anna-svabh 죠va 159, 165 Pars’ va 50 Parvafi 79 pa rya y a 183 pa sa 241,244 pa su 241,244 Pasup a ta s 241 Pas’ up a ta - yo g a 242 pa s’ utv a 244 -P ata l a 270 Pata li pu tr a 50, 76 Pata f i jal i 94 Pat.t. an a 64 pa ti 241, 244 p료ti mokkha 134 pe rcep tion n9
per son 261 Pii lga la 143 Plak~adip a 271 po te n cy 126 Prabhakara 196, 224 Prabhakara Mi sr a 188 pra dhana 41, 96 pr adhvamsabhava u3 pra g a bhava u3 Praja p a ti 24, 195 pra ji ia 36, 58, 135, 139, 146 Pra jii a p료 ra mita -hrda y a-s iitr a 138 Pra jii a p ara mit죠-pir:ig ar tha- sam .gr aha 168 Praji iap r adip a 143 pr aj.f~ la p ti 141, 151 Praji iap tiva din 63 pr akara 222-3 pr akarar:i a 92,127 Prakarar:i a p a ii cika 189 pr akari n 222 pra kasaka 96 Prakas, atm an 209-10 p rak 江i 39-41, 81-2, 85, 95, 209, 2I9, 222, 224, 23I, 233, 235, 그 38, 245,267,269 pra laya 96, 223, 270 p ram 료 II9 pra m5na I5, IO5, m8-9, I77, 230 Framana-ph a1a I72 Pramal). a samuccava 168
Pram 료 na 꿉 r tti ka 169, 174 pra mey a n8 pra l). a 책, 33, 36, 99 p rana y垣 na IO5 p r 칵ii dhana 134 pra pa i i ca r45,202,204 pra pa t t i 226, 235 pr ap ti 69 pra sada 40,226,233 pra sang a 145 Prasa 퍄gi ka 143 Prasannapa da 143 p rasar 핵 a 111 Prasas tap죠 da 108, 243 Prasna Up a ni~ a d 41 p ra tijii료 I22 pr ati sa mkhya -n ir o dha 70 pra ti tyas amutp ad a 55, 144 pra ty ab h ijiia 121, 242 Praty ab h ijiia 245 Praty ab h ijna -sii tra 246 pra ty aha ra 105 p ra tya k 惡 15, 47, 99, 105, II4, II9- 20, 169, 172, 174, 181, 190, 207, 230 Praty ek abuddha 139 Pravacanasara 180 pra vr tti-samarthya n 9 p ra 呼-vij喆 na I64 pra yo ja k a-kart r 129 pra yo ja n a u8
pre man 239 pre ta 271 . pr im a causa 56 pr th ivi IO9 Prth iv i 23 ps yc h e 259 pu dg al a 51, 72, 184 pu dg a la-nair a tm y a 68 Pug ga lap a fi fiat t i 64 ptja 2I8 pu l) .ya 133, 136 pu ral). a 108, 218, 233, 271 Pfi ra l). a Kassap a 44 pu rga t o r y 270 p uru 惡 27, 39, 41, 82, 85, 95, 219, 222,247 pu ru~art ha u, 49 p uru~a-samn i d hi -m 료t ra 97 Purusott am a 235 Pfi rv a-mi m amsa 26, 187-8, 225 piirv ap ak ~a 189 Pii rv asth a v ira 63 p u완i 237 Pu~ti -m arga 236 Pu~y am i tra S/' ung a 77 R Rab i ndran 료th Tag o re 255-6 R.ad ha 235, 239 raga 105 惡g havendra Yati 230
Raja g r ha 53 raja s 33, 96, 98, 224 Rama 252 Ramakris h na 256 Ramakris h na Mi ss io n 장 Ramananda 252 Ramanuja 83, 218, 221 Ramay a I.J. a 78, 218 Rammohan _Ro y 255 Rasesvara 242 Raurava-ag a ma 243 reason 12 re-cog n it ion 121 reducti o ad absurdum 145 renunc iat i on of acti on 82 repr e senta tion 162 ~g Veda 22 ~juv im ala 189 rta 23,28 Rudra 40, 79, 219 riip a 33, 54, 65, 69 Ri ipa 237 rii pa -dhatu 271 s S,, abarasvami n 188 Sabbatt ha vada 63 gab da I5, 48, IO5, II5, II9, I25, I27, I9I,I93 sabhag a ta 69 saq ay a tan a 55
Saddharmap u i;i 9 arik a -sut1 a 13 9 sadhy a 122-3, 175 S/' aiv a -bha~y a 245 S’ a iva -darsana 242-3 S’ aiv a -sid d hanta 221, 243 뱌 ara-vada 170 랴~i n 37, 204, 231-2 S’ ak tas 242 fak it i 96, 126, 192, 204, 236, 238-9, 242,247,259 sak tini p a ta 247 S 료ky a 53 Saky a muni 53 S’ ali ka nath a Misr a 189 Sama Veda 22 samadhi 58, 105, 152 Sama iiiiap h ala-sutt an ta 44 Samanta b hadra 135 samany a 1n saman y aolak 훈 a i:i a 121, 171 saman ya lak 흔적 a- p ra tyak훈 a 124 samavaya n2, 236 samavay i-k arai;i a 236 sambhog a kaya 136 samnid h i- s akti 238 Samdhin i r m ocana-sutr a 150 S 착 h g a ti 45, 189 samg h a 44, 133 samg h ata 184 samg h ata v ada 268 Sam hita 22, 187-8, 242
Sam 迫 54,66 sarhkhy a 17, 39, 67, 81, 92, 195, 200,222 Sarhkhy a -karik a 17, 93 Samkh y akar i k 죠 -bha~ y a 93 Samkhy a p r avacana 94 Sarhkhy a p r avacana-sii tra 93 Sarhkhy a sap tat i 93 Samkhy a -sara 93 Sarhkanti ka 63 Samkranti ka 63 Samk~ep a .sarir a ka 209 Sammati ya 63 Sammi tiya 63 saxhnid h i 127 samn y료 s i n 82-3, 87, 230 samsara I2, 237, 271 saxhsay a 118-9, 189 samsaya -h etu 177 samskara 54-5,66,98,101,104 samt an a 57, 71, 161 samt ati-par 4lama 72 samudaya 55 Samudrag upta 149 sa:th v ara 52,185 samv it-s ak ti 238 samv rtti 146 samvr tti-sa ty a 146 samy ag-c a rita 185 samy a g -d arsana 185 samy a g -jiian a 155, 185
samy a vasth a 97 sarhy o g a 97, 103, n2 sarhy o g a bhasa 97 Sarhy utta Ni k ay a 161 Sanata n a 237 S, afi jay a Belatt hi p u tt a 46 Sankara 34, 83, 189, 201, 203 Sankarasvami n 174 sankhata - dhamma 65 $al). l).a g a rik a 63 S, anskrit 21, 149 Santa r ak~it a n7, 169 sap tab hang i-n ay a 182 Sap tap a darth i 108 sarga 96,100 Sarip u tt a 46 Sarnath 53 Sarvadarsa..l a -sarhg rah a 242 Sarvajf iat m an 209, 220 Sarv 죠 s ti vada 17, 63-4, 66 Sarvep a ll i Radhakris h nan 260 s'-a·s'v ata v ada 56 Ss, aatt a p 3 a3 t,h 2a 0 5B, r2a1h0m, 2a3l)2. a, 23266, 238, 267 Sata v ahana 148 Sat- c it -a nanda 258 sati 254 satk arya vada 96, 205, 298
$ats a mdarbha 237 satt a II2 satt va 33,96, 133,224,226,235saty a 33 saty a g r aha 257 Sautr a nti ka 63-4, 70 self 259, 261 self -co nscio u sness 197 sense data 99 s’ esa 226 Se(lla 80, 219 Shah Jah an 253 sid d hanta n8, 189 Sid d harth a 53 Sid d hit ra y a 222 Sik hs 253 s, il a 58, 134 S, il a bhadra 173 S, iv a 18, 79, 217 Siv a dit ya 108 S/' iv a -d r :tl ti 246 Siv a ji ian a-bodha 243 Siv a ji ian a-sid d hi 243 Siv a -pr akasa 243 sSiivv aa -s usu ttrra a- v im 2 4a6r sin i 246 skandha 184 S/' loka-vart tika 169, r89 smrti 105, n9, 233 Soma 23 Somananda 246 soul 259, 261 spa n da 246 Sp an da-ka rika 246
Sp a nda-sastr a 246 spa rs’ a 55 spi ri t 261 i,,: ra- m ai:i a 44, 82 Sra uta Sutr a 86 S』· ravaka 139 s’ ra vana I 29 Sravasti 53 S/' ri 80 S, ri-b ha~y a 222 Sri-v ai~I .J.a va 221 S,4 rid h ara 108 S, rih arsa 2n S, rik aI.J .th a 245 Sr i m 繼 154 Srim ala-sutr a 150 Srin iva sa 234 sr~ti 270 sruti 181, 270 Sth avir a 63 Sth avi ra vada 62 Sth iram ati 70, 173 Sth u labhadra 50 sti ipa 74,136 substr a tu m 196 s, ubtl e body 101 Suddh 죠 dva ita 236 SS4 uuddhraa na2 7, 18460 Sufi sm 253 sukha 5I, I84
sukhavatl 138 Sukhavati vy il ha -sil tra 138 suksma,s arir a 208 Sumeru 270 summum bonum 207 sung a 148 Sunni 253 suny ata 145 S’ uny a ta s ap tat i r43 Sup e r Mi nd 259 Supe r man 259 Sup r eme 261 Suresvara 209-10 S 퍄y a 23 sutr a 17 나 )I Sutt av ada 63 Suvaq a ka 63 svabhava 68,70, 138,144,151 svabhava-anumana 176 svabhava-pr a ti ba ndha 176 svabhavavada 45 svalak~a1_1 a r70, 191 svarth a -anumana 122, 175, 177 svariip a -lak~aI_l a 245 svariip a -sakti 238 svasamvedana 172 svasamvit ti 172, 194 svata ~ -pr ama1_ 1ya 231 sva t a~- p rama l).y a-v 죠 da 193 sva t an tr asa tt걸 .ab 區 va 235 Svata n tr i k a 143
svay a mp ra kasa r72, 194 Sveta k etu 37 Sveti ira bara 50 S/' veta s vata r a Up a ni~ a d 34, 38, 79- swaraJ 257 syi idv ii da 182 sy ll og ism 177 sy n th e ti c jud g me nt 176 T ta d ekam 24, 266 tad tv am asi 37, 203, 207 Tait tiriy a Up a ni! }a d 34 tam as 33, 96, 224 Tam il 220 tan matr a 100 Tantr a 242 Tantr a vartt ika 189 tap a s 52, 94, 185 tar ka n6, n8-9, 124 tat a s th a -sakti 238 tat h ag a ta g a rbha r 50, r 53 가 t a t ha t죠 I55, I65 tat p arya 127 tat t va 247 Tatt vac int a m a1_ 1i n8 Tatt va dip a nib a ndha 235 Tatt va kaumudi 93 Tatt va p r adip ika 2n-2 Ta tt va p rak 죠 s i ka 230, 234 Ta tt var t h 료 dh ig ama-su tr a 180
Tatt va samg r aha 169 Tatt va vais a radi 95 te ja s 33, 1 oo Telug u 234 Teng a lai 226 tes ti m ony n8, 125 That One 24 Theravada 17, 52, 63 가 tiry a g yo ni 271 Ti r ta n kara 50 Ti ru nmurai 221 Tray a tr i m sat 271 Treta Yug a 219 Trik a 246 trika y a 136, 160 trilak ~ai;i a 151 Tr i m§ i k 료 I60, I62 Trip iµika 52, 64 tri s v a fha va 159, 165 tri v i d h a n il;i svabh 죠 va ta 165 tr~ i;i a 55 Tup tIk a I89 Tu~it a 271 tur iy a 37 u ucchedavada 45,56 ud 칵 larana I22 Uday a na 108, 117, 211 Udd 히 aka 33 Uddy o ta k ara 117, 169, 243
udg a tr 22. Udip i 230 Uma 79 Umap a ti 243 Umasvati 180, r8, unto uchables 254 up a cara 163 up a dana 55 up a dana-karal_l a 95, 129, 204 up a dhi 123, 205-6, 208 up a d hini r a sa 124 up a labdhi n 8 up a mana 119, 125, 190 up an aya 122 up an죠ya na 87 Up a ni~ a d 13, 16, 32,·187, 199, 217 up a sana 205, 207, 226 up a ya 139 u tk훈e p따 a III Ut pala 246 Ut tara-m xmamsa 187, 225 uUttt taarraap s a akil ~a a 6138 9 V Vac 23,33 V 료 ca spatimi sra 93, 95, II7, 1G9. 209-IO v 꼬 a II8 VacJ a g alai 226 Va ib h 료海i ka 67
Vaik u i. ttha Bo, 223 va1rag ya t o t Vais a li 53, 62 Vais e ~ik a 17, 67, 107 Vais e ~ik a -sutr a 17, to B Vais y a 27, 86 Vajj ipu tt ak a 63 Va j racched i표p ra jii a p ara mi댜 s iitr a t3 8 Valabhi 5t Vallabha 235 vanap r asth a 87 Vardhamana 49 varna 81 varna--as' rama 86, I48 Varw ;ia 23 vasana 72, 104, 162-3 Vasubandhu 67, n7, 150, 159, 160 Vasudeva 79-80 Vasug upta 246 Vasum itra ·63 , 70 Vats ipu tr i y a 63-4, , 72 Vats ya y an a n6 vayu IOO, IO9 Vayu 23 Vayu -pu rai.i a 242 Veda 15, 199, 220 vedan 료 54-5,65 Vedanta 17, 22, 30, 40, 83, 183, 187, 199,207 Vedanta - desik a 226
Vedanta - pa rija t a - saurabha 234 Vedanta - sii tra 199 Venkata n ath a 226 vib h ajj av ada 65 Vi bh ang a 64 vid e hamukti 208 vid h i 188 Vi dh i 26 Vi dh iv i v e ka 189 v i d y료 200 Vi gra ha-vy a varta n i 143 vij iian a 36, 54-5, 57, 66, 140, 151-2, 160-63,207,267,269 vi..j i ~ia- n a-pa ri.i : ia-m a 269 Vi jiian abh ik~ u 93, 95 v ijii료 nanan ty a 272 vij aa p ti I6I-2, I64 vij iiap ti-m atr a 152 vij iiap ti-m atr at a 150, 159, 162, 165 vik a ip a 105, 145, 155, 165, 170-71, I90 vika ra 33 Vi ma lakir t i 139 Vi m alakir t i ni r d es’ a-sutr a 139 v 函 a ti k 료 I6o, I62 vmay a 134 vip a ka 163 vip a ry ay a 105, u9 vip a sya na '15 2 vir y a 5I, I34, I84 vi뿐y a •” :•,3 •9 , 189, 210
vi~ a y a- vij iiap ti 164 vi~ a y a vit ti 194 vis e ~a IOO, IIO, II2, 203 Vi si ~ tad vait a 222 Vi sn u I8, 79, 217, 232 Vi~ i:iu- pu rai:i a 218 Vi sv akarman 24 vi tai: i 9 a n8 V i .H halan 죠t ha 235 Vi v arana 210 viv arta 202, 204, 235-6 viv arta v ada 35, 96, 104, 269 viv e ka-ji ian a Vi v ekananda 256, 260 Vorste l lung 161 Vrndavana 220, 234, 237 Vrtt ika ra 188 vy abh ic ar 죠g raha 124 vyap a ka 123 vy a p a ra 194 vy a pt i 48, 122-4, 175, 193 vya py a 123 Vy a sa 94, 102 vy a ti re ka 124 Vy a safi rtha 230 vy a vahara 151,204 vy avah 료r i kar t ha 206 Vy o mavati 108
Vy o masiv a 108 vyuh a 232 y Yadava 234 ya ji ia 218 Yaji iav alky a 37 Y 죠jii avalk y a-smr ti 86 Yaju r Veda 22, 26 ya ma 105 Yama 271 Yamaka 64 Yamuna 221 yat b artb a-anubbava 119 yo g a 78,152 Yog a 17,39 Yog a sara-samg r aba 95 Yog a -sutr a 17, 94 Yog a -sutr a -bba~y a 94 Yog a -vartt ika 95 yo g a bhy a sa 121 Yog ac ara 17, 150, 152, 159, 166 Yog a carabbum i 158 yog m 79 yo g yat a 127 z zone 270
吉熙星 서웅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졸업 하바드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전공 저 서 Chin u l, the Founder of the Korean Son Tradit ion 현재 서강대학교 종교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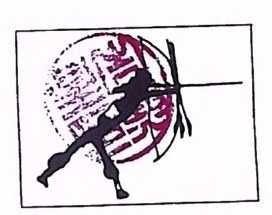
印度哲學史 1984 년 4 월 30 일 초판 1991 년 9 월 10 일 6 판 처 자 吉 熙星 발행인 朴 孟 浩 발행처 民 音社 출판등록 1966. 5· 19 제 1-142 호 우편대체번호 010041-31-0523282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번지 515~ 2 003 국 (편 집 부) 515-2000~2( 영업부) 515-2007, 2101 (팩 시 밀리 ) 파본은 바구어 드 입 니다· 값 7,000 원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l 韓國語의 系統 김방한 2 文學社會學 김현 3 商周史 윤내현 4 人間의 知能 황정규 5 中國古代文學史 감학주 6 日本의 萬葉集 김사엽 7 現代意味論 이익환 8 베트남史 유안선 9 印度哲學史 길희성 10 韓國의 風水思想 최창조 11 社會科學과 數學 이승훈 12 重商主義 김광수 13 方言學 이익섭 14 構造主義 소두영 15 外交制度史 김홍철 16 兒童心理學 최경숙 17 언어심리학 조명한 18 法 사회학 양전 19 海洋法 박춘호 • 유병화 20 한국의 정원 정동오 21 현대도시론 강대기 22 이슬람사상사 김정위 23 동북아시아의 岩刻畫 황용훈 24 자연법사상 박은정 25 洪大容評傳 김태준 26 歷史主義 아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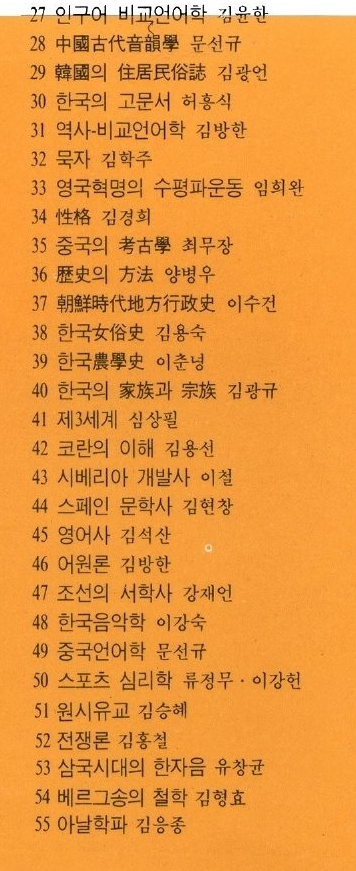 인 구 야닙벗연어학 다 윤- 한
인 구 야닙벗연어학 다 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