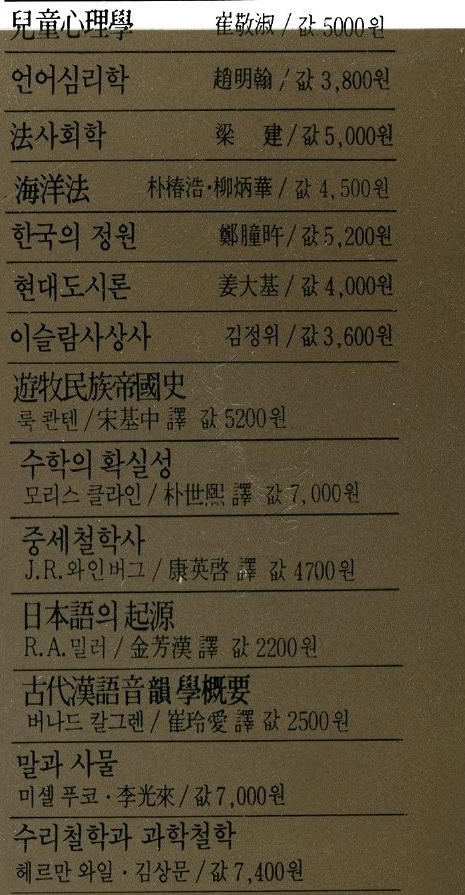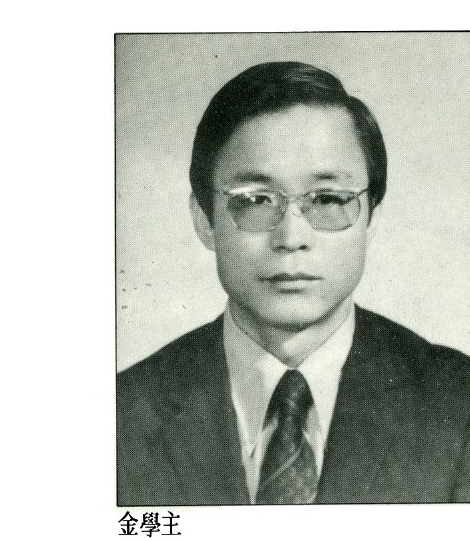 金學主
金學主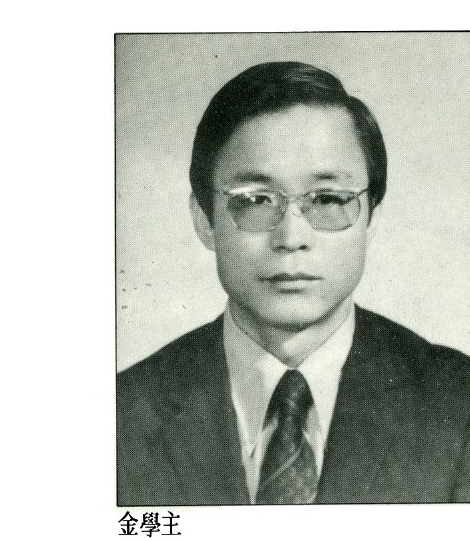 金學主
金學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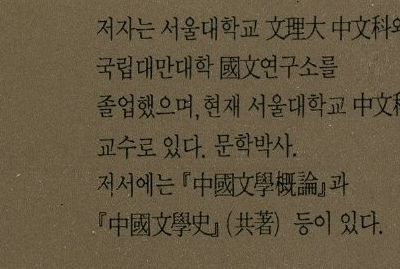
 中國古代文學史
中國古代文學史
머 리 말 이 『 중국고대 문학사(中國古代文 學 史)』는 중국 사람들의 자기 네 고 대문화에 대하여 지닌 선입견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인 입장에 서 중국문학사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고대 〉 문학의 성격과 흐름을 밝혀 보자는 의욕에서 착수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고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 년 전에서 2000 년 전에 이르는 1000 여년간에 걷찬 시대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시대의 문학사 자료들은 모두 어느 정 도까지 믿어야 할는지 갈피를 잡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이 〈 고대 〉 에도 한자( 漢 字)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지마는, 아직도 한자의 자체(字 體 )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고문자 시대(古文字時代) 〉 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문학의 자료들이 모두 본시논 제각기 다론 자체의 한자를 사용 하여 서로 다른 문빕 아래 씌어졌었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 위에 이것들은 대체로 대쪽이나 나무쪽에 써서 책으로 엮은 것들이어서, 오래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 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고 대문학의 자료들이란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변혁을 겪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변혁은 모두 적어도 한(漢)대 이후에 새로 동일된 자체로 다시 베껴지고, 또 책의 체계도 모두가 다시 정 리하여 편정(編定)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접이다.
그 위에 또 이들 자료는 모두가 1000 년이란 건 〈고대〉 중의 어느 시기를 대표하고 있는 작품인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십지어 전국 ( 戰 國)시대 제자(諸子)들의 책까지도 모두 그 작자가 알려지고 있기 논 하지만, 실제로 그 책이 한 시기에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 어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이 책들이 그처 자로 알려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후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 은 형식의 책으로 이루어전 것입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씌어지고 고쳐진 것인지 확 언할 길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국고대문학사〉를 객관적 과학적 인 태도로 쓴다는 것은 의욕과는 달리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었다. 다만 아전의 〈중국문학사〉를 쓴 분들이 〈 고대 〉 문학을 에워 싸고있는여러가지 문화적 득칭들에 대하여 소홀했던접을약간보 충한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 〈고대〉에 있어서 의 한자의 발달상황 및 고대인의 문장의석, 작가와 독자의 성격 같 은 것은 그 시대 문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 소일 것인데도, 이제껏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크게 주의 를 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화적인특칭을올바로파악한위에 그시대의 문학은올바로 이 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러 한 새 로운 각도에 서 〈중국고대 문학사〉를 쓴다는 일은 필자에게는 능력에 비하여 지나찬 욕십인듯하다• 본시는 중국 고대 문학의 몇가지 문제접만을 제시하려는 뜻에서 〈중국고대문학론〉을 쓰고자 하였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데에 경제적 인 후원을 한 〈 대우학술문화재단〉 기획부의 다론 분야의 처술들과의 군형을 위한 조정에 따라 〈문학론〉이 〈문학사〉로 바뀌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 내십 두려울 따름이다. 어떻돈 중국의 고대문학은 중국문학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 한 시 도는 중국의 고대 문학분만이 아니 타 중국문학사 전체를 올바 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들 림없이 있을 것으쵸느 생각되는 찰못에 대하여 여러분의 거리낌없는 가르침이 있기를 간절히 빈다. 1983 년 5 월 8 일 金學 主
中國古代文學史 차례
머리말―3一. 序說1. 〈고대〉의 문학사적 특징―122.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작자―173.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독자―214. 〈고대〉의 字와 그 書寫 방법―235. 〈고대> 중국인의 문학의식―316. 〈중국고대문학사〉의 방법―35〈문학사 참고도서〉―37二· 『詩經』1. 서론―412. 중국 고대의 〈시〉에 대한 인식― 463. 『시경』의 내용―604. 『시경』의 문학적 성격―695. 결론—79〈참고도서>—82三· 『書經』1. 『서경』의 성격과 저작 시기一852. 『서경』의 편찬과 그 내용―903. 『서경』의 문장과 특징—934. 후세 문학에의 영향—102〈참고도서〉—108四. 戰國時代의 문학
1. 〈紀事〉의 글—111I. 『좌전(左傳)』 113 • 〈참고도서〉 1252· 『국어 (國語)』 I27 • 〈참고도서〉 1353. 『전국책 (戰國策)』 I36 • 〈참고도서〉 1432. 〈立言〉의 글――― 144l. 『논어 (論語)』 147 • 〈참고도서〉 1532. 『맹자(孟子)』 155 • 〈참고도서〉 1603. 『묵자(墨子)』 162 • 〈참고도서〉 1674. 『장자(莊子)』 168 • 〈참고도서〉 1765· 『순자(荀子)』 178 • 〈참고도서〉 1866. 『한비자(韓非子)』 187 • 〈참고도서 > 1957. 『여씨춘추(呂氏春秋)』 196 • 〈참고도서〉 200五. 餘論1. 〈중국문학사〉에 있어서의 『楚辭』의 문제一2032. 〈중국고대문학사〉에 있어서의 소설 • 희곡—2133. 중국 고대문학의 성격—2244. 한자와 그 書寫方法의 발달을 통해 본 중국 고대문학사의 시대구분—229색인 1 人名—237색인 2 事項 • 冊名一242一. 序說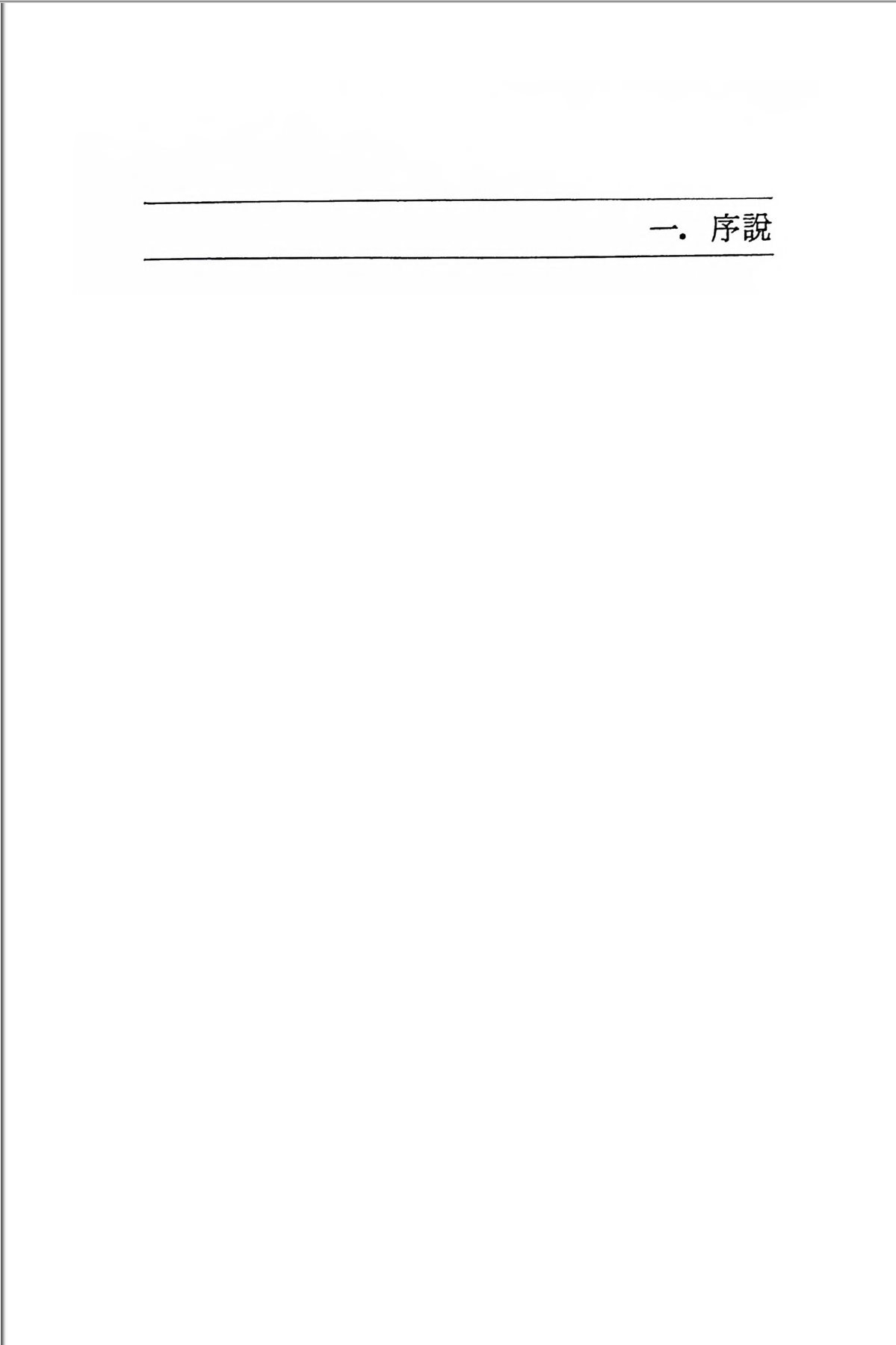
이미 우티 나라에도 대여섯 가지 〈중국문학사〉가 나와있고, 중국 을 비롯하여 일본 및 구미 여러 나타에서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중국문학사〉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근년에는 중 국 대륙에서 사회 • 경제사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중국 문학사〉가 여러가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학사들의 거의 모두가 중국사람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선입견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문학사의 전개 를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고대문학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중 국 고대문학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작품의 완성연대와 작가의 생애 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대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고대의 작품을 중십으로 그대로 그 시대의 문학을 이해하고 문학 발전의 흐름을 과 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십지어는그시대의 문화적인 성격이나 작품을 쓴 작가들이나 그것을 읽은 독자들의 사회적 성격 및 작품 을 쓰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한 고려도 매우 소홀한 돗하다. 따라서 고대의 작품들을 전통적인 학설대로 그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 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은가, 또는 그 시대의 작가들이 이 작품들을 어떤 의식 아태 썼는가 하논 문제조차도 별로 따져본 예가 드문 것 같다. 근래에 대푹에서 나온 〈중국문학사〉 중에는 새로운 입장에서 문학사의 흐름을 정리하려고 애쓴 것들이 여러가지 나왔지마는, 아 직도 모두 자기네 전동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벗 어나지 못한 듯하고, 또 현대인의 입장에서 고대 문학 작품들을 그 대로 받아 들이며 새로운 해석이나 하려는 태도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듯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이런 종전의 문학사들이 지 닌 문제접들을 감안하면서, 이 문학사를 쓰는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고대 〉의 문학사적 특칭
여 기 에 서 말하는 고대 문학의 〈고대 〉는 이 른바 선진시 대 (先 秦時代 ) 와 대략 맞먹는 시대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서 다루어진 시대 는 주(周)나라 초기 (B.C. 1122 무렵 )부터 전시 황(秦始皇)이 천하물 동 일한 무렵 (B.C . 246) 까지 인 서 주(西周) • 동주(東周)시 대 이 다. 중국에 는 이 미 상(商)나타 시 대 (B.C . 1751~B.C. 1110)1) 에 도 한자 (甲骨文, 金文)가 통용되었었고, 그 한자의 발생은 다시 5000 년 이상 울 거슬러 올라간 태고시대에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이 문자학자들 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것은 곧 중국문학의 기원은상황(三皇) 오제(五帝) 같은 전설적인 임금이 다스리던 태고적까지도 소급할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주나라 이전의 상나라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학으로 다물 만한 구체적인 작품울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다. 갑 골문(甲骨文)은 모두가 간단한 접 (占)을 찬 기 록이 니 문제 삼을 만한 굳이 못되고, 여러 전적들 속에는 요(堯) • 순(舜)임금 때의 격양가 (擊壤歌)” • 경운가g卽雲歌 )3) 를 비롯하여, 은(殷)나라 말엽의 백수가 (麥秀歌 )4) 와 채미가(採薇歌 )5) 등도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 믿을 게 못
1) 董作賓 • 嚴一芹 共編 『年代世系表』(豪北藝文印 합館 ) 의 거 •
2) 見於 『帝王世紀』· 짬 皇甫諸 編. 3) 見於 『尙합大傳』 · 4) 見於 『史記』 宋微子世家. 5) 見於 『史記』 伯夷列傳.
된다. 상나라때에는무(巫)가성행하여 6) 여러 가지 귀신을 섬기며 갖 가지 제사를 지냈는데, 노래와 충으로 강신(降神)을 하기도 했거니 와 그 밖의 노래와 충도 퍽 유행했었으니 상당한 수준의 시가(詩歌) 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서경( 간經 )』 상서(商간) 의 반경(盤庚) • 고종융일(高宗形日) • 서백감려(西伯戱黎) • 미자(微子) 같은 편에는 상나라 사(史)의 유문(造文)이 어느 정도 담기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나라 때의 산문의 수준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 나 지금 우리에겐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니, 이 시대도 문 학사에서 메어 버리는 수밖에 없다.
67)) 이십 지문 어제 太논 戊뒤 의대 에『는시경. !巫I咸 ., I i'祖서경乙.!때l을 에논 는술 할巫땄 때이 자나세라히를 다다시스 렸얘다기(할『史 것記임』. 殷本紀).
따라서 중국문학사는 주(周)나라 때의 『시 경』 • 『서 경』에서 그 출 발을 잡는 수밖에 없게 된다. 『시경』에는 상송(商碩)이 들어 있지만 그것은 송(宋)나라의 노태였음이 분명하고, 『서경』에는 요건(堯典) 울 비 롯하여 하서 (夏 書 ) • 상서 (商 書 )가 들어 있지 만 모두 주나라 때 의 사관(史官)들의 손에 이루어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확실한 〈중국문학사〉는 주(周)나라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주나라 시대는 봉건사회(封建社會)의 초기 단계로서 처음에는 크 고 작은 수백개의 국가와 부락의 집단이었으나 뒤에 가서는 영주 (領主)들 사어에 서로 랫고 빼앗기는 전쟁이 벌어져 종말에는 일곱 개의 큰 나라만이 남았었다. 이 때의 천자(天子)는 온 세상의 예악 (禮樂)과 정벌(征伐)을 관장하게 되어 있었으나, 뒤에 벌어전 약육 강식의 혼란 속에서는 다만 질서를 대표하는 상칭적인 존재에 불과 하였었다. 그리고 이 때의 주나라 영역이란 것도 황하(黃河) 유역을 중십으로 한 일부 지역에 불과하였고, 뒤에 장강(長江) 유역이 중국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 했었다. 그러나 전시황의 통일로 말미암아 정치권력이 황제에게로 집중되었고, 그 영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크기로 거의 굳어졌다 .8) 따라서 〈고대〉를 계승하는 진한시대(秦漢時代)란 정치적
8) 물론 만주(滿洲) • 몽고(蒙古) • 서 장(西藏) 같은 변두리 지 역 까지 영 토로 확보되 었다는 뜻은 아니다.
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후기 중국 봉건사회의 터전이 마련되었던 시 대이다. 선전시대엔 황하유역을 중십으로 한 제한된 지역 안에 봉건 지배 계급인 사대부중심의 문화가발달하였었다. 득히 주나라말기의 전 국(戰國)시 대 에 는 유가(儒家)를 비 못한 제 자백 가(諸子百家)들이 나와 한문화와 학술이 다양하고 화려한 발전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전시 황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이어 온 천하의 경제 제도와 학술 • 문자 둥을 통일하였다. 이를 이온 한(漢)나라는 진나라의 정치적 경제 적 문화적 통일을 계승하면서 초(楚)나라를 비롯한 다론 지역의 문 화까지 흡수하여 새로운 중국문화의 터전율 마련한다. 한나타 무제 (武帝, B.C. 140~B .C . 87 재 위 )는 공자(孔子)의 가르침 을 그 시 대 상 황에 맞도록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유가사상을 정치원리로 받아들 여, 그것이 이후 2000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동한(東漢)에 완성되었덴 도교나 새로 운 불교의 수입도 더욱 폭넓은 중국문화의 형성을 이룩하게 한다. 그리고 주나라 때의 문학은 개인의 굳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 l1 서집단 또는 그 집단에 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실용적인 문장이었 다. 동주(東周)에 와서는 개인의 이름 아래 전하는 여러가지 저작들 울 남기고 있지만, 그 책의 처자들이 직접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굳은 매우 적 다. 『좌전(左傳)』 • Ii'국어 (國語)』가 좌구명 (左丘明)이 란 노(魯)나라 사관성澤)이 쓴 글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후인이 고치거나 덧붙인 글이 많으며, 또 좌구명이란 이름만이 확 실할 분, 그가 어느 때 어떻게 살았고 이 책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가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밖의 제자백가의 경우도 모두가 그러 하다. 따라서 유가의 경전이나 제자백가들의 글은 모두 세상을 올 바로 다스리고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나갈 길을 계시하기 위하여 쓴 글들이고,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도 실은 세상울 올바로 지배하는 데 도움울 주기 위한 굳이지 지난 시대의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전한(秦漢)대에 들어와서는 주나라 때의 이러한 글들을 계승하면 서, 다론 한편으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그 자체에서 순수한 아름다
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수사( 修辭) 를 통한 미의식( 美意識 )의 추구는 곧 글을 쓰는 사람의 개성을 드러나 게 하여 작가들은 모두 자기 이름을 작품 앞에 분명히 내세우게 된 다. 이 것 을 주도(主財)한 것 이 한부(漢賊)이 다. 그리 고 굴을 동한 사 람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은 또 수사와 다른 아름다움을 이물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산문에 있어서는 이미 진나라나 한나라 초기 에 도 그러 한 아름다움의 추구의 가능성 을 막연히 나마 느꼈 던 듯하나, 그 본격적인 전개는 동한(東漢) 때에 유행하기 시작한고시 (古詩)부터라 할 것이다. 어떻든 이러하기 때문에 진한대는 중국문 학사가 본격적인 전개를시작한시대라는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 크게 볼 적에는 전한대가 이전의 한문화에서 벗어나 보다광범한 중 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 며, 중국의 학술사나 사상사도 선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전개를 보여준 시대라 할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서 〈중국문 학사〉는 〈 고대〉를 벗어남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선전시 대 의 주나라는 서 주(西周 B.C. 1122~B.C. 771) 와 동주 (東周 B.C. 770~B.C. 247) 로. 나뉘 어 지 고, 동주는 다시 춘추(春秋 B.C. 722~B .C . 481) 시 대 와 전국(戰 國 B.C . 403~B .C . 221) 시 대 로 나뉘 어 전 다. 서주시대에는 그 시대에 지어졌다는 굳둘이 전하기는 하나, 그 것들은 모두 동주시대에 이루어전 책들에 실려 있는 것들이다. 춘 추시 대에는 일부 유가의 경전이 이루어진 이의에 공자 • 노자 • 좌구 명 (左丘明) 같은 저 작을 남건 사람들이 나왔다 하나, 실상 이 들의 이 름 아래 전해지는 책들은 『춘추』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전국시 대에 그들의 제자들 또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이 루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전국시대에 와서야 이른바 〈제자백가〉들 이 쏟아져 나와 수많은 처서를 남기게 된다. 전한시대에도 진나라는천하를 통일하기는 했으나 동치 기간이 너 무나 짧았고, 한나라만은 다시 서 한(B .C.206~A.D . 24) 과 동한 (A.D. 25~195) 으로 나뉘 어 진다. 서 한은 사부(辭賊)를 중십 으로 하여 문장 의 수사를 동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대이고, 동한에 와 서는 고시(古詩)가 유행하면서 문장의 형석미분만이 아니라 그 내용
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의 추구가 가능함을 깨우쳤던 시대이다. 그리 고 서한대에도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작품을 쓰기는 하였지 만, 글을 쓰는 문인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은 뚜렷치 못하 였었다. 문인 또는 지석인둘의 사회적인 자각은 동한에 와서야 이 루어진다. 따라서 〈중국문학사〉에 있어 서 의 〈고대 〉란 본격 적 인 중국문학의 전개를 준비하는 시대이다. 〈고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칭은 그 문 장들이 실용(宜用)과 비실용의 구분도 애매하고, 십지어는 산문과 운문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았으며, 그 글이 역사적인 것인지 철학 적인 것인지 또논 문학적인 것인지도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라는 접이다. 그분 아니라 한자(漢字)의 자체도 아직 통일되지 않고 문법이나 문장의 표현 기능조차도 완비되지 못하였던 시대이다. 지 금 우리가 보는 〈고대〉 문학의 자료들은 모두 한(漢)대 이후에 정 리되고 확정된 것이어서, 그 처작의 체계나 문장까지도 후인들의 손질이 모두 가해진 것이라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국 〈고대〉 문학의 자료나 그 문학적인 성격 이 후세의 것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고 대〉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검토하여야만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2.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작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국 고대문학의 작가들이란 거의 모두 가 봉건지배계급에 속하거나 지배계급으로 발돋움하려는 사대부들 의 작품이다. 따라서 그 작품이라는 것도 모두가 그 시대의 도덕에 바탕을 둔 정치와 관련 있는 것들이다. 간혹 『시경』의 국풍(國風) 에 들어 있는 민가(民歌)들처럼 서민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하 나,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전한 것은 사대부들이며, 따라서 서 민의 감정이나 생활을 노래한 민요라 할지라도 그 해석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행하여졌고, 그것들이 전해지고 읽혀 전 의의도 정치적인 가치에 있었다. 시 대 별로 따져 보면, 서 주의 작품들이 란 모두 사관여봐f)에 의 하 여 기록되었거나 정리된 것이다. 사관들은 극히 적은 수의 동치자 들(천자를 중십으로 한)을 위하여 이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며, 또 그 일은 사관들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던 가업이었기 때문 에, 거기에서는 글을 쓴 사람들의 자기 의식이나 개성 같은 것은 찾 아보기 힘들다. 동주로 들어오면서 춘추시대에 와서는 제후들의 나라가 서로 싸 우기 시작하여, 여러 나라마다 제각기 천자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 때문에 춘추시대에 와서는 천자 의 사관보다도 여러 제후의 나라들의 사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다. 그러 나 나근택 (羅根澤)이 「전국 전에 는 사가(私家)의 처 작이 없
었음을 논함」이란 논문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춘추시대엔 아직 개 인적인 굳이란 출현하지 않았었다. 공자가 이전의 기록들을 정리하 여 편정 (編定)한 유가의 〈육경 (六經)〉이 이 시 대 의 가장 두드러 진 입 적이었다. 춘추시대에 와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서주 봉건제도의 기 반인 종족제도가 맥을 못 추게 되고 여러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 더 욱 첨예화한 전국시대에 와서야, 새로이 등장한 각 지역의 지배재 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작가들이 쏟아쳐 나왔다. 예를 들면 새 로 일어난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대두한 지주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가(儒家)와, 전란중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서민 세력을 대표(서민울 위하는 게 아니라 서민의 입장을 지배에 반영시키려는 것이었지만)하는 묵가(墨家)와, 새로 등장한 지주와 상인들의 이익 울 대표하는 법가(法家) 둥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그러한 독칭이 강한 일정한 지역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들 제자백가도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를 바로 이끌 어 보려는 의식울 전혀 버리지 않았었고, 신분은 여전히 사대부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었다. 반고(班固, 32~92) 의 『한서( 漢밤 )』 예문 지 (藝文志)를 보면, 제 자(諸子)의 원류를 논한 대 목에 서 각각 유가 (儒家)는 사도지 관(司徒之官)에 서 나왔고, 도가(道 家 )는 사관(史 官 )에 서, 법가(法家)는 이관(理官)에서, 명가(名家)는 예관( 禮 官)에서, 묵 가(墨家)는 청 묘지 수(淸廟之守)에 서 , 종횡 가(從橫 家 )는 행 인지 관(行 人之官)에 서 , 잡가(雜家)는 의 관(議官)에 서 , 농가(農家)는 농칙 지 관 (農稷之官)에서, 소선가(小說家)는 패관(牌官)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전국시대의 작가들이 모두 개인적인 입장에서 굳울 쓴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배집단울 대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작가들도 개인이나 개성 같은 것은 문제삼 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금 전하여지는 제자백가의 처서들도 거의 모두가 사실은 그 작품을 그들이 직접 쓴 것들이 아니다.
9) 顧頓剛 編 『古史辨』 四冊 上縱 所跋.
전한대에 들어와서야 작가들은 바로소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자 기 책임 아래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사(修辭)가 중십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글이 정치와의 관련이나 실용을 떠나 아름다움
이나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따 라서 정말로 작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진한대에 비로소 나타 났다 하여도 과언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작가둘이 굳 울 쓰는 명분을 완전히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서 발견하였거나, 지 배계급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었다는 뜻은 아니다. 한나라 고 조( 高 祖)나 무제 (武帝)처 럼 , 한대 에 들어 와서 는 천자나 귀 족들도 자 기의 위세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글을 쓰거나 아태 사람을 시켜 글을 짓게 한 데서,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촌재하였던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문학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작가와 그들의 작품울 중심 으로 문학의 흐름을 엮 어 왔다. 그러 나 우리 는 〈중국고 대문학사〉의 경우 이러한 작가들이 전정한 의미의 작가라 할 수 있 는가 한번 반성해 볼 팔요가 있을 것 같다• 서양의 경우에도 중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으 로서의 작가나 예술로서의 문학에 대한 개념이 촌재하지 않았다. 그 때 문에 현대 프랑스의 비 평 가 롤랑 바르트 Roland Ba rt hes 는 중세 기의 작가룬 다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10) 첫째는 전사자(薛寫者, Scr ipt or ) 로서, 그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베끼기만 하는 사람이 다. 둘째 는 편찬자 Corn pi la t or 로서 , 그는 그 자신의 것 이 아닌 모든 것을 덧붙일 수 있다. 세째는 주석자 Commen tat or 로서, 그는 원전 울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이다. 네째는 처자 au t hor 로서, 그는 그 의의 딴 사람이 생각한 것에 기대 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감히 발표하는 사람이타는 것이다 .11)
10E) cLo'lae nPcirea n tni qe u e rhDeetso r Hiqa uu ete s- AEi td ue d -mese—m Coeirn e t ,r e AD. 'e6t. u 2d . e s Lb'eecsr itC, omCommumniuc na tiic oa nt i oDn es masse, 1970.
11) 이상 김현의 『韓國文學의 位相』 p . 10 의 요약을 대체로 전재한 것임.
롤랑 바르트의 작가들을 두고 중국의 고대문학 작가들에 대하여 반성해 불 필요는 없을까? 『시경』 국풍이 민요라하여 주나라 시대 의 서민들을 그 작가로 보는 게 옳을까? 『서경』 요전(堯典) • 하서 (夏 밤 ) • 상서 (商 書 )의 굳둘이 각기 요임 금이 나 하나라 • 상나라 때 사 관(史官)의 기록이라 하여 그 때의 사관을 작가라 보는 게 옳을까? 그들보다는 『시 경 』 • 『서 경 』의 편찬자나 전사자들의 의 식 이 작품의
성격 형성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 을 주 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학술사적 또는 문학사적 의의는 주석자들에 의하여 부여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경』의 민요들은 후 세의 지식인 인 편찬자와 전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다음 그 문장은 다시 그 들 에 의하여 수식되고 고쳐진 것이며, 주석자들에 의하여 그것들은 성인(聖人)의 도( 道 )를 밝히는 글로 해석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이 다. 제자백가들의 글도 마찬가지이다. 『논어』나 『장자』 • 『묵자 』 라 하더라도 그것온 공자나 장자, 묵자의 손에 의하여 직접 씌어진 것 둘이 아니라, 편찬자들에 의하여 문장으로 옮겨졌고 전사자들에 의 하여 수정이 가해졌으며 au t hor 인 저자에 의하여 내용이 추가되었 던 것이다 . 『장자』의 외편(外篤) • 잡편( 雜篇) 같은 것들이 그 좋 은 보기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그 학술사 또논문학사적인 가치는주석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후 세에 오랜 세월을 두고 후인들이 이해하였던 그들 작품의 성격은 공자나 장자 • 묵자의 의도보다도 주석자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석자 들도 공자나 장자· 묵자 못지 않게 작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의 경우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 고대문학사 〉 에 있어 서도 작가의 성격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작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중국의 고대문학사의 흐름을 좀 더 올바론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와 아울러 어느 시대건 문학의 발전이나 흐름은 작가나 작품에만 의존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의 독자의 성격이나 처술의 방법, 책 의 형태와 그 보급방법 및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 동 여러 가지 여 건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사는 종래 의 작가와 작품 중십의 서술에서 탈피하여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득히 중국의 〈고대〉와 같은 정치 • 사회 • 경제 • 문 화 동 모든 면에서 특수한 조건 아태 있었던 시대는 더욱 그러하 다. 그러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면으로부터의 재검토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학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특수한 조건들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 야만 할 것 이 다.
3.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독자 옛날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 사회에 있어 목수한 계층에 속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쓴 것을 읽고 즐기는 사람들도 특수 계층 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고대문학사에 있어서는 그 글을 쓴 사람 들도 중요하지마는 그 굳을 누가 쓰게 하였는가, 또는 그 굳을 누 구를 위해 썼는가, 쉽게 말하면 독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 도 그에 못지 않거] 중요하다. 서주시대의 글들은 모두 일부 통치자들, 곧 천자와 그 주변의 및 사람둘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서경』의 바탕이 된 사관의 기록 이 란 모두 천자(天子)가 천하(天下)를 다스리 는 데 참고자료로 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사관이 목표로 한 독자는 천자 한 사람 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관들은 천자가 그들의 기록을 동하 여 이전의 시정(施政)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규범들을 알아 올바론 정 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다만 『시경』의 국풍(國風)에 실린 가요(歌語)나 소아(小雅) • 대아(大 雅)의 일부분의 시들은 처음부터 천자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 그 대부분이 민간에 유행하던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런 민간의 노래를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 까닭은 동치자가 그것들을 동하여 민정을 파악함으로써 정치의 참고 자로를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주시대의 작가 인 사관은 순전히 천자를 위하여 굳을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것은 이 시대의 작가인 사관이 완 전히 독 자인 천자의 장악 아래 있 었음을 뜻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주시대에 와서도 그 시대의 문학의 독자는 여전히 일부 통 치자 들이나, 이 때는 여러 나라 들 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이므로 이 시 대의 통치자들이란 천자분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제후들과 그 냐 라 정치를 주무르던 권세가들도 포함하게 된다. 작가 쪽에 사관분 만이 아니라 사대부들도 가담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독자의 법위도 서주에 비하여는 약간 넓어졌던 것이다. 동주시대에 있어서도 뒤의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나라들이 천자의 촌재조차도 무시하고 약육강석의 처철한 싸움을 벌였으므로 여러 나라들은 제각기 다른 입장을 지니게 되고, 통치자들도 제각기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었다. 이에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자기가 처한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배집단의 이익울 대표하게 되고, 또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 놓아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학파를 선택하고 그 학프}의 이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대립되는 다른 학파들을 비판하 기 위해서는 사대부 자신들이 여러 작가들의 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 시대의 독자층으로 사대부들이 비로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장 사용의 보편화, 곧 독자층의 확대는 다음에 울 진한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시대에 다론 독자들의 성격 변화는 그 시대 문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작용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 문학 작 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문학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시대 독자층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고대 〉의 漢字와 그 書寫 방법 중국 고대문학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할 일인데도 이 제까지 소홀하였던 것이 그 시대의 한자와 그것을 적던 방법 및 책 의 성격 동에 대한 검토이다. 중국 고대의 한자는 지금 우리가 혼 히 보는 한자와는 굴자 모양이나 그 글자의 유통 상태가 아주 달랐 고, 또 그것을 쓰는 방법이나 기구 같은 것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 다. 그리고 그것은 문장의 성격이나 그 동용에 큰 제약을 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한자는 여기에서 다루는 고대문학사의 시기 이전에도 이 마 쓰여지고 있었다. 온(殷)나라의 갑골문자(甲骨文字)나 동기 (銅器) 같은 데 새겨져 있는 문자들은 문자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오렌 동 안의 발전을 동하여 상당히 세련된 모양을 갖춘 한자라 여겨지고 있다. 주나라 때에 와서는 한자도 훨씬 발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문자학사에 있어 고문자(古文字)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하 고 있었다. 문자학사상 고문자의 특칭은 자체(字體)도 통일되지 않 았을 분만 아니라 그 모양도 정제화엔f化) 되지 못하였던 데 있다. 주나라 선왕(宣王, B.C .827~B .C .782 재위) 때의 태사(太史)인 주(摘)가 한자의 자체를 정리하여 〈주서(雍 書 )〉 또는 〈대전(大篠)〉이라 부르는 새로운 자체를 만들었다 한다 .12) 옛날에는 당얘f)대에 진창(陳倉) 에서 발견되어 지금은 북경(北京)에 보전되고 있는 석고(石鼓)에 새 겨 진 석 고문(石鼓文)을 〈대 전〉의 대 표적 인 자료라 생 각하였으나, 뒤 12) 許愼 『說文解字』 序 및 『漢 꿉 』 藝文志 참조.
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많아져 13) 지금 와서는 도 리어 과연 〈대전〉이 어떤 모양의 글자였는지 확증할 길이 없게 되 었다. 그러나 이 태사 주에 관한 기록들은 서주 말년에 와서는 왕 조를 중십으로 혼란했던 그 시대의 자체를 통일하고 한자를 정리하 려는 노력이 있었음울 증명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 떤 〈대전〉 또는 〈주서〉는 주나라 왕조의 관정문자(官定文字)의 시도 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이 이전의 자체에 비 하여 얼마냐 개전된 것이며, 그것이 중국문화 발전에 미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언할 자료는 없다.
13) 근래 馬衡온 『石鼓文爲秦刻石考』에서 이것이 秦나타 때의 글임을 자세히 考證하 고있다.
동주로 들어와서는 춘추시대에 공자가 이전의 기록들을 정리하여 이 른바 〈육경 (六經)〉울 산정 (嗣定)하여 중국에 본격 적 인 전적 (典籍) 둘을 이룩해 놓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시대에 와서야 전적을 정리 하거나 처술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자로 중국의 한자 자체가 초보적 인 정 리 가 이 루어 졌 던 듯하다. 허 선(許愼)의 『설문해 자(說文解字)』 서(序)에서는 이 때에 쓰였던 글자가 〈고문(古文)〉이라 말하고 있지 만, 이 고문은 〈대전〉을 중십으로 한 이전의 고문자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자체의 한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대로 와서는 제후들이 서로 싸우면서 제각기 다른 방석의 정치를 하고, 지역에 따라 언어도 달랐으므로 한자의 독음 과 자체가 제각기 달라졌다 .14) 남쪽의 오(吳) • 월(越) • 초(楚 )15) 지방은 후세까지도 북방과는 다론 방언을 쓰고 있으니, 이 시대에 논 제각기 자기네 말에 따라 서로 달리 한자를 읽는 것은 물론 서 로 다론 글자들울 만들어 내기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는 각 나타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제자백가타 불리게 된 사상가들이 나와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였으므로, 비록 통일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자 또는 한문이 한 단계 더욱
14) 許愼 Ii'說文解字』 序; 「其後諸侯力政, 不統於王, … ••• 分爲七國……言語異聲, 文字 異形, ....... 」
15) 지 금의 강소(江蘇) • 철강(浙江) • 호북(湖北) • 호남(湖南) • 사천(四川) • 구 1 수(貨 州) 지방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대전〉이 그대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진시황은 중국에서 실로 가장 먼저 천하를 동일한 임금일 분만 이 아니라 한자의 자체도 그에 의하여 바로소 통일되었다. 이는 승 상 이사(李斯)의 건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이 때 이사는 『창힐 편(倉韻篇)』을 지었고, 중거부링(中車府令) 조고(趙高)는 『원력편(愛 歷篇)』을, 태 사령 (太史令) 호무경 (胡毋敬)은 『박학편(博學篇)』을 지 었 는데 ,16) 「모두 사주(史掃)의 대전(大鉉)을 취하여 퍽 생략하고 개량 한 것으로 이른바 소전(小菜)이라는 것이다」 17) 고 한다. 〈소전〉은 진 전(秦接)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산비(擇山碑 )18) 가 그 대표적인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전〉은 통일을 이룩하여 널리 통행될 여유 를 갖지 못했기 때 문에 , 당란(唐蘭)은 〈소전〉울 고문자계 열에 속해 야 할 성 질의 것 이 어 서 〈근고문자(近古文字)〉라 부르는 게 옳을 거 라 말하고 있다. 19) 따라서 그는 〈근대 문자〉의 시 조는 바로 예서 (隸합) 라고도 말하고 있다.
1176)) 許班愼固 『『漠說많文』解 字藝』文 志序, 인許용愼. 『說文解字』 序 참조.
18) 譯山은 山東省에 있는 山名. 秦始皇 2 紗 F (B .C. 219) 에 秦德을 碩揚하기 위하여 山上의 돌에 李斯의 굴을 새긴거라 한다(『史記』)· 그러나 진짜는 없어지고 지금은 唐 鄭文쨌의 蟲刻이 전한다.
19) 『古文字學惡論』 樂天出版社 .
〈예서〉는 전시황 때의 정막(程逸)이 낮은 관리들이 쓰기 편하도록 〈소전〉을 더욱 간략하게 다듬어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20) 〈예서〉의 작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이도 있으나, 여하 몬 진시황 때 더욱 간략하고 모양이 다듬어진 새로운 자체가 개발 되어 이후 널리 동용되기 시작하였음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예 서〉가 여러가지 기록에서 〈도례(徒隸)〉나 〈이졸(吏卒)〉 • 〈예인(隸人)〉 둥 낮은 산분의 사람들이 쓰기어 1 편하도록 간략하게 만든 것이라 하고 있으니 21) 여 기 에 서 문장의 작자와 함께 독자층이 비 로소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예서〉가 더욱 다듬어져 지금도 우리
20) 蔡葛 『聖皇篇.ll, 江式 『進文字源流表』 등 참조.
21『) 說『漢文밥解』字 』藝 文自志序;; 「「是是時時秦(秦 .••).•始. 大造發隸書吏矣率. 興起役於戌官,獄 官多役喜職,務 緊荀趙,省 初易有,隸 施합之,於以越徒約急易也..」 」 衛恒 『四體합勢』; 「秦事繁多, 策字難成, 則令隸人佐활, 臼裁字. 漢因用之, 獨符靈 幡信題署曰鉉. 隸합者, 條之捷也. 」
가 쓰는 한자의 대표적인 자체인 해서( 權書) 가 동한(東漠) 무렵에 이 루어 졌고, 22) 또 이 를 쓰는 데 따라 자체 가 약간 변하여 초서 ( 草법) 와 행서(行 書 ) 같은 것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정치 • 문화나 마찬가지로 한자도 자체의 동일을 이루어 〈근대문자〉가 형성된 것 온 전( 秦 )나라 때이고, 그 〈 근대문자〉의 본격적인 동용은 한( 漢) 대 에서 비못되고 있는 것이다.
22) 張懷瑾 『 書 斷.!I에선 王倍율 引用하여, 束漢 章 帝 (76~88 재위)때의 王次仲이 隸 草를근거로 槿 書 몰 만둘었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하는 〈고문자〉는 모두가 동기(銅器)나 병기gt 器) 또는 구갑( 危甲 ) • 수골(默骨) 및 들 같은 데에 새겨진 것이다. 그리 고 고대의 책은 대부분이 죽간(竹簡) 또논 목독(木)債)에 써서 가죽 끈으로 엮은 것이었을 것이나, 이것들은 모두 썩어 버려 지금은 벌로 남은 것이 없다 .23) 춘추시대 무렵부터는 비단도 쓰이기 시작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값이 비싸 널리 통용되지는 못한 듯하 다. 24) 편리 하고 간편한 책 이 출현한 것 도 동한(東漢) 화제 (和帝, 89 ~105 재위) 때에 채문(蔡倫)이 종이를 발명한 이후의 일일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23) 1955 1f. 湖南省 長沙에서 出土된 43 片의 『仰天湖楚簡』이 가장 오태된 것이며, 漢 簡온數種이 있다 .
24) 昌彼得 『中國圖 書 史略』
글씨를 쓰는 봇과 먹물도 〈고문자〉시대에는 벌로 발달하지 못했 울 것이다. 고문자는 지금 뼈나 쇠 • 돌에 새겨진 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필기용구가 사용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가 없 다. 그러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글자의 모양을 통해서 보더라도 서 주(西周) 이전의 필기용구는 일정하지 않았울 듯하며, 적어도 〈 대 전〉이 나온 뒤 동주여周)에 와서야 글씨의 획이 다듬어졌으니 필기 용구도 그때 와서야 일정한 모양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봇이나 먹이 형태를 갖춘 것은 아무래도 〈예서〉 이후 〈근대문자〉의 동행과 때를 같이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 쓰는 것과 같은 편리하고 부드러운 봇이나 먹의 완성과 보급도 동한凍漢)때에 종이가 발명되고 해서(槿 書 )가 동용되기 시작하는 것과 때를 같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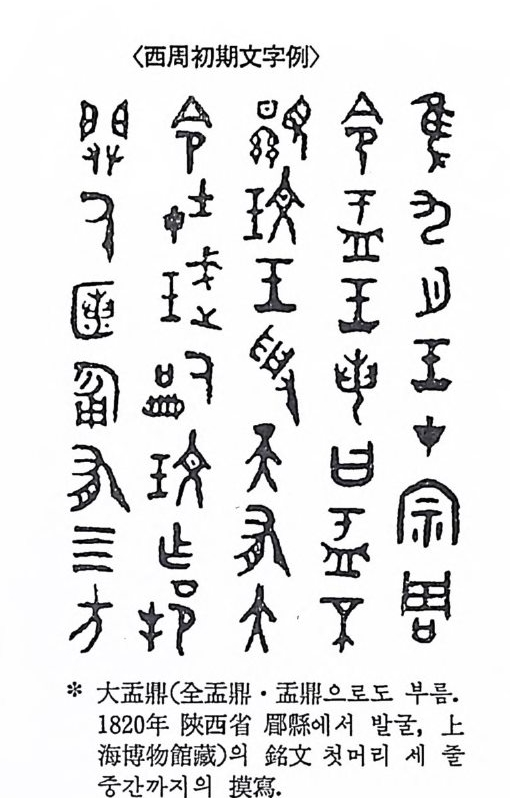 * @1節大1--A--鬪汗8孟20鼎 年( 론터검갑 급陝全-TA西孟省 鼎 •*굿入 麗 `I%孟招伏:縣鼎에으 서 로mTHT 中ATHIT도발굴 ,부 름亨Q팅 9I 컫갑.上
* @1節大1--A--鬪汗8孟20鼎 年( 론터검갑 급陝全-TA西孟省 鼎 •*굿入 麗 `I%孟招伏:縣鼎에으 서 로mTHT 中ATHIT도발굴 ,부 름亨Q팅 9I 컫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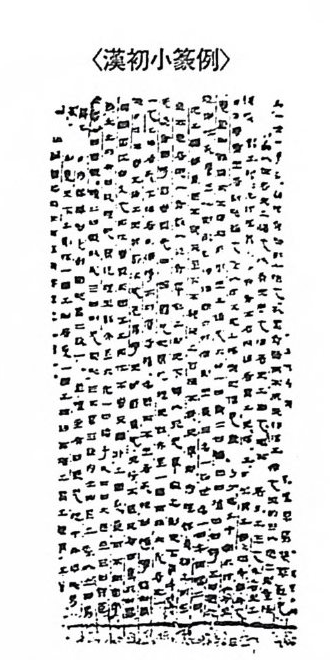 〈漢初小策例〉
〈漢初小策例〉
* 漢初의 用書老子의 일부(1 973 년 長沙 馬王推에 서 발굴됨 )
루는이 와 A/문 장같은의· 고성대격 에한 자지의대 한자 체영 와향을 서 끼사치방지법 ( 書않 寫을方 수法)가은 없그었것을으 쵸것 L 이이 다. 주나라 시대에 있어서는 글자의 모양이나 자획이 다듬어지지 않아 글씨를 쓰고 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글자의 자 체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통일되지도 않았고 그 문자의 동용 범위도 별로 넓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서사용 구( 書 寫用具)도 불완전했을 것이며, 문자의 사용 계층이나 사용 목 적도 매우 협소했을 것이다. 동주에 와서는 자체가 어느 정도 정비 되기 시작하였으나, 대신 한자가 상형문자라는 독성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른 여러 종족과 넓은 지역에 사용케 되어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났었다. 이러한 한자와 서사용구의 성격은 그것으로 표현하는 문장의 성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문장과는 판이한 것으로
발달시컸다. 우선 서주에 있어서는 글을 쓴다는 것은 사(史)라는 극히 제한된 일부 전문가의 전업(專業)이었을 것이다. 이 때의 한자는 모양도 복 잡하고 다듬어지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라면 쓰고 읽기가 쉽지 않았 을 것이다. 그리고 자체도 동일되지 않아 굳을 쓰는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돗하며, 그에 따라 글을 쓰는 용구들도 서로 같지가 않았을 것이다. 책을 만드는 기본 자료인 죽간(竹簡)은 그 면에 일 정한 한계가 있고, 글자 한 자를 쓰는 것도 적지 않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뜻의 표현은 되 도록 축약(縮約)되 어 야만 하고 문장의 형 석 은 되도록 간략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한대까지도 책의 기본 재 료였던 죽간이나 목독(木胎)은 그 길이와 너비가 일정하여 일정한 수의 굳자를 쓰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하였다. 이 때문에도 중국문 장은 정언演璃)의 시에 가까운 굴이 더욱 발달하도록 강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가 상형문자라는 것도 문장을 되도록 축약하고 간략하게 쓰도록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가하였을 것이다. 중 국에 있어서는 고대문학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 문장이 그들의 일상용어와 판이하고, 뜻이 응축된 시적인 문장이 존중되고 있는 것도 이것이 큰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한자의 자체분만이 아니 라 독음도 한 글자가 제각기 한음철로 된 음을 지니고 있어, 이 굳 자들이 두자 이상 결합할 적에는 독음의 해화(諸和)가 문제가된다. 따라서 중국문장의 시 적 인 발달은 한자의 독음으로 말미 암은 성 운 (聲韻)에 대한 배려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자체와 서사 용구에서 오논 제약 이의에도 서주시대에 있어서는 『시경』이나 『서 경』처럼 그 글의 독자가 본시는 천하의 최고 통치자인 천자(天子)였 다는 것도, 더욱 그 문장을 의식(儀式)적인 것으로 만들었울 것이 다. 서주 말영부터 문자 통일의 팔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여 〈주서(摘 書)〉가 나오기도 했었으나, 곧 시작된 춘추시대의 혼란은문자통일 을 불가눙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자 통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전 자체의 발전은 이 시대의 문장의 독자가 천자로부터 제후와 여러 나타의 귀족들로 확장되 고, 문장의 작자도 사관분만이 아니 라 뜻을
세워 글을 배운 일부 사대부 들 에까지 확대되는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장은 봉건사회의 지배계급 사이에서나마 일 반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서주시 대의 기록이라는 것은 실은 모두 이 시기에 초보적으로 정리되고 편찬된 것으로 보여전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여러 나라들 사이의 분쟁과 중국문화권에 속 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문자의 통일은 더욱 큰 혼란을 가져왔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 나라에는 제자백가라 불리우게 된 지석인들이 쏟아져 나와 자기 유파의 사상 을 선전하려고 적극적인 저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문장은 봉 전 지배계급 사이에 더욱 일반화하였을 분만이 아니라 문장의 기교 도 더욱 세련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고대문학 작품들은 이 시대 에 와서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정치적 • 지리적인 동일의 뜻만이 있는게 아 니라 문화적인 의의도 곁들여 있다. 〈소전〉을 동해서 문자가 통일 된 이후 비로소 개성적이고 일반화한 문장이 확정된다. 이사(李斯) 의 산문과 그 시대의 각석문(刻石文) 등이 그 보기이다. 그러나 본 격적인 중국문학의 전개는 〈소전〉이 더욱 간화하고 다듬어져 〈예 서〉로 발전한 뒤, 곧 〈예서〉가 통용되기 시작한 한대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고대 중국의 한자의 성격과 그 서사( 書 寫)의 방법은 그 시대 문학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서주시대에는 민간에 아름다운 노래나 애기가 유행되 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의 한자나 그 한자의 서사 방법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것이 못되었다. 굴자의 모양이 까다몹고 쓰기도 힘들어서 사람들의 말이나 노태를 그대로 적는다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또 그것을 죽 간(竹簡)에 적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래나 얘기를 거기에 적어 널리 보급시키기에는 너무나 번중(繁重)한 것이었다. 그러니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되 도록 그것을 축약하여 뜻만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 밖에도 그러한 문자의 특성이나 서사 방법에서 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과는 다른 문장의 목칭은 일일이 들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대문학을 얘기 하면서도 그 시대의 문자의 목성이나 서사 방법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5. 〈고대〉 중국인의 문학의식 먼저 고대 중국인들이 〈文〉이란 글자의 뜻울 어떻게 이해하였는 가 알아보자. 첫 째 ; 〈文〉은 본시 〈무늬 (紋)〉의 뜻이 어 서 동한 허 .1-J_(許愼)의 『설 문해자(說文解字)』에서 「文이란 획(it!J)이 엇섞인 것이니 무늬가교차 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2S) 고 설명하고 있다 .26) 한대 유회(劉熙)의 『 A4 명(釋名)』에서 「文이란 여러가지 채색을 모아 가지고 비단의 수 를 이문것이며, 여러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말뜻을 이운것도 수놓 은 무늬나 같은 것이다.」 27) 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늬〉의 뜻이 같 은 수식성 때문에 〈굳〉의 뜻으로 그대로 옮겨졌음을 설명한 것이다. 둘째 ; 〈文〉은 고대의 예의 • 제도, 28) 넓게는 〈문화〉에 가까운 말 로도 쓰였다 .29) 그것은 곧 세상울 문화적으로 다스리는 데 팔요한 여러가지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세째; 〈文〉이란 성인의 가르침이나 성인의 덕(德)에 관하여 씌어 있는 〈경적(經籍)〉둘을 뜻하기도 한다 .30) 여기에서의 〈성인〉이란 말
25) 「文, 鉛盛也, 象交文. 」 26) 『禮記』 樂記에서도 「五色成文而不亂」이라 하였다.
27) 「文者, 台菓衆綜 以成錦縱; 습菓衆字, 以成辭義, 如文羅然也. 」
28) 『國語』 周語 上, 韋昭 注; 「文, 禮法也. 」 又 「文, 典法也. 」 劉向 『新한.!I 容經; 「有儀而可政, 謂之文. 」 29) 『論語』 子平; 「文王匠沒 文不在炫平 ? 」 30) 『國語』 周語 下, 韋昭 注; 「文, 詩합也.」. 『論語』 휴而; 「ft l J以學文」, 皇但疏: 「文郞五經六箱也.」
할 것도 없이 대체로 옛날의 성왕 (聖 王)을 가리키는것이다. 공자까 지도 선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 았지만 왕자(王 者 )로서의 할 일을 했다 해서 〈 소왕( 素 王) 〉 이라 부름 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31)
31) 『孔子 家 語』 本姓 解 및 『春 秋左傳 』 序 참조 .
네째; 〈 文 〉 은 다시 성인의 덕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 였 다 . 3 2) 곧 〈 인덕(仁 德)〉 이란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는뜻이다.
32) 『詩 經 』 大雅 江 漢 ; 「告于文人.」, 毛傳; 「文人, 文 德 之人也.」 『國語』 周語 下, 韋 昭注; 「文者 , 德 之 總 名. 」
다섯째 ; 〈 文 〉 이 〈 아름다움 〉 또는 〈훌 륭함 〉 이 란 뜻으로도 쓰였 다 .3 3 ) 이것은 성인의 덕에 관하여 쓰인 굴을 뜻하던 〈 文 〉 이 뒤에는 성인의 덕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 것과 같이, 〈 아름다운 무 늬〉나 〈 아름답고 훌륭한 글 〉 의 개 념 이 발전하여 〈 아름다움 〉 또는 〈훌륭함〉의 뜻이 나왔을 것 이 다.
33) 『 禮 記』 樂記;「以進爲文. 」 鄭 玄注; 「文, 猶美 也, 善 也. J
여섯째; 〈文〉은 물론 글이나 문헌의 뜻으로 쓰였다 .34 ) 후세에 산 문인 〈필( 筆 )〉의 대 로 압운(押 韻 )한 글을 가리 키 는 뜻으로 〈 문 〉 을 썼다든가, 고문가(古文 家 )들이 산문을 전체적으로 가리키어 〈 문 〉 이 라 하였다는 경우는 고대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34) 『 論 語』 八僧; 「文軟不足故也. 」
여기에서 〈 文〉이 위 둘째 • 세째 • 네째의 뜻으로 쓰인 것은 고대의 경우 글의 독자가 천자(天子)에서 시작하여 뒤에도 후 왕 (侯 王 ) 이나 귀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독자가 천자나 후왕들이었고 쓰는 사람은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로서 글을 썼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은 성인의 덕에 의한 다스림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위 첫째 • 다섯째의 뜻은 한자의 특성과 서사용구의 제약으 로 인하여 생겨난 수식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 의 문장이 그 목적은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데 있으면서도 그 문장 자체는 수석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었 음을 뜻한다. 문장의 실용성과 수식성온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다. 중국문장은 처음부터 이 모순 되는 양면성을 지난 채 발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 중국고대문학〉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뜻
하는 〈 문학〉이란 결국 문자로 씌어전 모든 굳율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실용적 인 문장과 문학적인 문장의 구벌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분 아니타 산문과 운문의 구분도 뚜렷치 아니하고, 또 그것이 정 치 ·사회 • 역사·철학·문학 동 어느 분야에 속하는 굳인지도 분명 치 않다. 말을 바꾸면 산문이라 보아도 되고 운문이라 보아도 좋은 글들이 많고, 또 모든 학문 분야에 널리 관계되는 글들이 대부분이 라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중국문학 발전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 찬다. 그들이 문학론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 문학이란 세상을 올바 로 다스리 는데 도움을 주는 〈 풍유(誤 諭 )〉의 뜻이 담긴 굳이 어 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글을 짓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수 사에 중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고대문학사에 있어서는 중국 고대에 이루어 전 모든 글, 곧 경 (經) • 사(史) • 자(子) • 집 (菜)에 속하는 모든 자료 둘이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정은,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문자와 그것을 쓰는 도구 및 글을 쓰는 목적이 이상과 같았기 때문에 이미 글을 쓰 논 행위나 문자의 성격 자체가 귀족적이었다. 어느 지역의 문학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가 다 민간에서 이루어져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 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자와 문장의 성격 때문에 민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굴로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면 귀족적 인 성향을 며게 된다. 그것은 『시경』 국풍이 가장 좋은 보기라 할 것이다. 국풍의 시들이 민간가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지만 이미 그 문장기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조차도 대부분이 귀족적인 것으로 바뀌어쳐 있논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고대인들은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논 성인의 정치를 이룩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글을 쓰고 또 그것을 존 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문자는 쓰기에 까다롭고 또 그것을 쓰는 재료는 일정한 글자가 씌어지는 죽간(竹簡)이나 목독(木版)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글씨 속에 많은 뜻이 담겨 있고 또 한 귀절의 글자 수가 되도록 일정한 글을 쓰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한자의
회화적인 성격과, 한 음절로 이루어지는 한자 발음이 문장을 이물 때 해화(諸和)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형석상 및 성 운(聲韻)상의 수석이 중요시 되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글을 쓰는 목적인 실용적 성격에는 적합치 못한 운문인 시가 더 발달하고 존 중되었던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중국의 고대인들은 글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단 굳을 쓰게 되면 문장의 수사에 몰두하고 마는 경향을 브이었다. 공자가 「말로 표현해도 무늬(아름다운 글)가 없 다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한다.」 35) 고 말한 것도 그 러한 문장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35) 『左傳』 襄公 二十五年, 孔子曰 ; 「 ...... 言之無文, 行而不遠. J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중국의 고대문학 작품울 문학이란 입장에 서 대할 때, 결국온 그 내용보다도 수사(修辭)를 중시하지 않을 수 가 없게 한다. 더우기 한대에 와서 중국의 문인들이 수사를 통해서 문학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중국의 문 학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6. 〈중국고대 문학사〉의 방법 이상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대문학을 논함에 있어 혼히 소홀히 해 온 몇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 봤다. 이몰 바탕으로 그 시대의 문학사 를 엮 는 방법에 있어 주의 를- 기울여야만 할 문제들을 간추려 보기 로한다. 첫 째; 중국의 역사적인 발전, 곧 정치 사회 상황의 변화와 그 나 라의 영역의 변화에 따론 문학의 사적 흐름의 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서주 초기의 중국의 강토( 疆 土)가 지금 우리가보통 생각하는 중국보다는 훨 씬 좁은 범위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춘추시대에 와서 중국의 역사무대에 끼어들게 된 장강( 長 江) 유역의 오(吳) • 월( 越 ) • 초(楚)나라의 대두가 중국문학사에 끼쳤을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진시황( 秦 始皇)의 천하통일 이 지니는 문학사상의 의의에도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작자 • 독자의 문제와 한자와 서 사( 書寫 )의 성격 동을 논할 적에도 고려되었지만, 문학사의 전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더욱 제십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둘째 ; 일정한 시대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그 시대의 작품이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팔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논한 〈고대문학〉에 있어서의 작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일정한 시대의 작품이라 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학사상 그 시대의 작품
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와 미슷한 형식의 작품이 그 시 대에 어느 정도 읽혔거나 그러한 작품의 제작이 조금이라도 유행되 지 않았으면 안될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 고대문학 작품들은 이런 의 미 에 서 그· 작품의 문학사상(文學史上)의 시 대 를 다시 한번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36)
36) 이 문제에 대하여는 끝머리 餘 論 에서 다시 논할 것입.
세째; 중국의 고대문학사에 있어서는 중국 고대의 모든 글이 그 연구 대상이 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한편 이 모든 굳이 정치사 • 사회사 또는 사상사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 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의 평가나 시대적인 의의는 정치 사회나 사 상의 입장에서 이들을 다룰 때와 완연히 달라야만 할 것이다. 예 를 들면 『시경』 속에는 적지 않은 서주시대를 대표할 정치 • 사회 • 사상등에 관한 여사적인 자료들이 담겨쳐 있지만 이것들을 바로 서 주의 문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국풍(園風) • 소아 (小雅) • 대 아(大雅) • 송 (OO 의 내 용이 나 문체 가 서 로 다른데 문학사 적인 면에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 같은 것이다. 이 런 경우 우리는 고대 중국인의 문학의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지니 논 문학사상의 의의를 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네째; 일정한 시대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정치 • 사회 • 사상 등의 배경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경우 앞에서 논한 작자· 독자 • 한자 및 서사 방석과 그 시대 사람들의 문학의석 동이 종합 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근거로문학사의 시대구분 문제 도 다시 한번 검토해 불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대문학 〉 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중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은 크게 문제 될 수가 없을 분이다•
08�Yլ� 8��
ij�0 0�e֊-NW�ex[�S0 ʎ�v/�(�et>y, � ��, 1974). 0-NW�ex[�S0 9eck,g, ёx[;N" N�{ �� qQW�(T�T�QHrlQ�S, � ��, 1989), 0-NW�ex[�^��0 9eck,g, ёx[;N(T�T�QHrlQ�S, � ��, 1983). 0-NW�e�d�i֊0 ёx[;N(�eŖ>y, � ��, 1977). 0!|f-NW�ex[�S0 -NW���eOxvzg(x[�e>y, 'Y��,1982). 0-NW'Y�ex[�S0 lW �CQu(-N��f@\,1918). 0-NW�ex[2�S�S0 lW o�ckte(IQf�f@\,1929). 0-NW�ex[�S0 lW ���(�Hr ��S ,{N�f@\,1932). Ii'�c�V,g-NW�ex[�S0 lW -�/c��(�Hr S�N \O�[�QHr>y,1932). 0-NW�ex[|vU\�S0 lW �R'Ypg(�Hr ��S -N� �f @\)" 0-NW�ex[�S0 4 Q�l �WSNYx'[-N �e|}�(��Nl�x[e19,6) 00.-NW�ex[�S 30 �Q, lW- W�Ny x[ b��}(�Nl�ex[,1962 ). 0-NW�ex[�S 0�4Q, l W8W,n`Ii �{d(�Nl�xe,9[41.6 )-NW0�ex[�S0 lWI�va�p �d(��S �^�e�f@\,196 6). Hitosryo f Chinese Ltieratue r ,Herber ltlAen Glie, sR erp i nt (�S� e���f^f,9100.) hiCnese Literatreu: A iHsorti ca nl It roduc ti n(o -N0Wex�[�Su0)e,Ch'e hnuS-oYi (NweY ok,r 1961). Nots e o hniCneseLi ertauet:r Withit rnodutocyr remarks o tnhepo grress-ive advan cement of the ar 二· 『詩經』
二· 『詩經』
1. 서 론 『시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이며, 혼히 중국문 학의 비조@祖)라 일컬어지고 있다. 『시경』온 서주 초인 B.C. 1100 년 무렵부터 춘추시대인 B.C. 600 년 무렵까지 약 500 년 사이에 지어전 민간가요와 사대부(士大夫)들의 . 작품 및 임금둘이 종묘(宗廟) 에서 선조들울 제사지낼 때 부르던 노래들을 후세 사람이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 시들이 정확히 어느 때에 지어 졌고 또 언제 이것들을 누가무엇 때문에 정리하여 책으로편찬했으 며 ! , 그 문장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서주 이전 시대에도 중국에 시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영 (明)대 양신( 楊 愼, 1488~1559) 의 『풍아일편 @M 雅逸篇)』 • 풍유눌(馮惟 訥 , 1550 년 전후)의 『풍아광일(風雅廣逸재 및 『시 기 (詩紀)』의 전집 10 권 고일(古逸) 속에는 『시경』 이전의 작품이라고 전하는 시가들이 거의 모두· 모아져 있다. 신농(神 農 ) 때의 사사(籍辭)〔『 禮 記 』 鄕特性〕, 황제 (黃帝) 때 의 란가(彈歌) 〔『吳越春秋』〕 • 유영 씨 송(有級氏碩) 〔『莊子』 天運〕 • 유해 시 (遊海詩) 〔王 嘉 『捨遺記』〕, 소호(少昊) 때 의 황아가(皇峨 歌) 〔同上〕 • 백제자가(白帝子歌) (同上〕, 요(堯)임금 때의 격 양가며頃壤 歌의) 〔경王운充가 籍@웁虛衡歌』) 藝〔增『〕尙 • 書 강 大구傳요』(〕康 •需 남藩풍)가[(『南列風子歌』) 仲[尼『〕孔,子 家순語@』f )辯임樂 금解〕 때. 우제 가(處帝歌)( ; 經』 益稷〕, 하(夏)나라 때의 도산가(塗山歌) 〔『吳越 春秋』〕 ·오자가(五子歌) (『 習 經』 五子之歌〕 • 하인가(夏人歌 )(R g詩外傳』〕,
상(商)나라 때 의 반명 (盤gt)〔 『綾 記』 大學〕 • 상림 도사(桑林 誌 辭)[『荀子』 大略〕 • 상명 (商銘)[ 『國語 』J 둥이 그것 이 다. 그러 나 이 것 들은 대 부분 이 후세 사람들의 위탁임에 들림없으며, 간혹 진짜가 있다 하더라 도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굴로 씌어질 때 고쳐지고 다듬어전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믿을게 못되므로 『시경』으로부터 중 국운학사의 출발윤 잡는다 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시경』에는 서주 때의 시도 있지만 가장 늦은 시대의 것으로는 춘추시 대 진(陳)나라 영 공(靈公 B.C.613~B.C.599) 때 의 시 들도 있으 니 적어도 『시경』은 그 이후에 이루어전 책이다. 그리고 『시경』의 편자가 공자라 하지만 『좌전(左傳)』 양공(襄公) 29 년의 기록에는 오 (吳)나라의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노(魯)나라로 가서 『시 경』의 움 악들을 연주하는 것 을 감상하는 대 목이 보인다. 그는 15 국(國)의 노 래들을 차례로 감상하고 각각 평을 한 뒤, 다시 소아(小雅) • 대아 (大雅)와 송(碩)도 감상을 하고 있다. 노(魯)나라 양공 29 년 (B.C.544) 온 공자가 여덟살 때이므로, 이미 공자에 앞서 노나라 궁실에는 주 악(周樂)인 『시경』이 전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 나라의 공자인 계 찰이 노나타에 와서 특별히 요청 하여 이 『시 경 』들 을 감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춘추시대 가장 전통적인 문화 의 중십지였던 노나라의 왕실에만 보존되어 오던 자료였던 것 같 다 .I)
l) 황하 하류 지방의 노나라 이외에도, 춘추시대에는 황하 상류의 주(周) • 전(秦) 지 역과 남쪽의 초 0 造)나라도 각각 독립 된 문화권을 이루었던 듯하나 Ii'시 경 』 갈은 자료는 그 쪽에는 없었던 듯하다.
그러면 『시경』에 실란 시가들은 어떻게 노나라 왕실에 모아져 있 게 되었는가? 『한서(漢 함 )』 예문지(藝文志)에 옛날에는 입금이 시 를 보고 각 지방의 풍속을 살피고 정치의 찰잘못을 알아 시정의 참 고로 삼기 위하여 각 지방의 시가들을 수집하는 〈채시지관(採詩之 官)〉을 두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어 (國語)』 주어 (周語) 상(上)에 는 이와 비슷한목적으로 천자(天子)가 청정(聽政)할 적에는 〈현시(獻 詩)〉를· 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it-jj)편에는 천자가 지 방울 순수(巡狩)할 적 에 는 태 사(大師)로 하여 금 〈전시 (陳詩)〉
를 하게 하여 민풍 (民風)을 살 피었다고도 하였다. 곧 『 시경 』 의 시들 은 관리들에 의하여 천자의 정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러 나 청 (淸)대 의 최 술(崔述, 1740~1816) 이 그의 Ii'독풍우지 (認風 偶 識 )』”에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실제로 채시관(採詩官) 같 은 관리나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나 『좌전』 같 은 곳에 인용되고 있는 춘추시대의 시의 쓰임을 보면 대아(大雅)와 송(碩) 같은 시들이 전례(典 禮 )에 쓰인 이외에 윗사람의 찰못을 간 접 적 으로 깨 우치 기 위 한 풍간(讓陳)과 자기 감정 의 표현 수단으로서 의 부시(賊詩)를 간혹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용례는 외교사철둘이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서로 시를 한 귀철 또는 한 수 씩 읊음으로써 자기의 뜻울 서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기에 『논어 (論語) 』를 보면 공자가
2) 卷二 通論十三 國風.
3) 『古史辨』 第三冊 下編 ; 「詩 經 在 春秋戰回間的地位」라는 顧頓1'1l l 의 論文에도 그 대 엔 『詩經.!I이 1. 典祖, 2. 誤ID!!, 3. 陳 詩 , 4. 言語의 네 가지 로 應用되 었음을· 논하 고있다.
「『시경』울 전부 의운다 해도, 그에게 정치를 맡기었을 때 거기에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전문적 인 옹대 를 하지 못한 다면, 비록 많이 왼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 있겠느냐?」(子路〕 4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장의 작자나 기록자가 사 관(史 官 )이고 독자는 천자였으며, 그 때의 기록이란 모두 관부(官 府)에만 보존되어 있었음을 생각할 때, Ii'시경』도 정치와의 관련 아 태 기록되고 모아졌던 것임에 몰림 없다. 그런 접에서 청 말의 장학 성 ( 章學誠 1738~1801) 이 그의 Ii'문사통의 (文史通義)』 첫 머 리 (易敎上) 에서 「육경(六經)은 모두가 사(史)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고, 이어 「옛날 사람들은 책을 저술하지 않았고, 옛날 사람들은 일찌기 일을 떠나 이치를 말한 일이 없었으니, 육경은 모두 선왕 (先王)들의 정전(政典)이다」 5)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Ii'시경胎i l 도 적용되는 말이다.
4) 「踊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 使於四方, 不能喜對 ; 雜多, 亦 笑以爲 ? 」
5) 「古人不著만 ; 古人未쌉離 事 而 言 理, 六經皆先王之政典也. J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학 또는 시를 얘기할 때 그것은 직 접 정치의 참고자료의 의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논 『시 경』이 지니는 고대에 있어서의 정치자료로서의 의의 이외의 가 치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옛날 중국 사람들이 『시경』울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본시 『시 경 』은 역 (易) • 서 ( 합 ) • 예 (禮) • 악(樂) • 춘추( 春 秋)와 같 이 〈경〉자는 붙이지 않고 〈시〉로만 불리어졌었다. 책을 존중하는 뜻에서 〈경〉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말엽인듯 하며 ,6 ) 더우 기 『시경』이란 칭호가 일반화한 것은 명(明)대 이후인듯 하다. 따 라서 옛날 책에서는 거의 모두 『시경』을 〈시〉라고만 부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찍 부터 〈시 〉를 존중했으면서 도 〈시 〉가 무 엇인지 구체적인 정의를 시도한 사람은 없다. 『모시(毛詩)』 서(序) 에,
6) 전국 만년에 이 루어 진 1i 透 t 0 』 經解편, 『莊子』 天運 • 天下편, 『荀子』 勸學편 둥의 용례가 그 시작인돗 하다.
「〈시〉란 뜻(志)이 표현된 것이다. 마음 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가장구 체 적 인 예 이 다. 동한(東漢) 허 선(許愼)의 『설문(說文)』에 는, 「〈詩〉는 뜻(志)을 말한다. 言온 뜻을 취하였고, 寺는 소리를 나타 낸다.」 8) 고 하였고, 다시 유회 (劉熙)는 『석 명 (釋名)』에 서
7)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 言 爲詩. 」
8) 「詩, 志也 ; A 言寺聲. 」
「〈시〉는 표현하는 것이니, 뜻(志)이 표현된 것이다.」 9) 고 역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을 분이다.
9) 「詩, 之也 ; 志之所之也. 」
이처럼 고대 중국인들은 〈시〉란 〈뜻을 표현한 것〉이란 정도의 생 각을 지니고, 이를 촌중하여 후세 문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하 고 있는 것이다. 〈시〉가 〈뜻을 표현한 것〉이라면 『서경( 합 經)』 같은 데 실려 있는 산문은 〈일(事)에 관한 기록〉, 다시 말하면 칙접 〈정치 와 관계되는 기록〉이탄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구분하였던 것 같다. 후세 문학에 있어서는 시와 산문의 구일은 그 내용보다도 표현 형
석이 더욱 중요하지만,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논한 바 와 같이 복잡하고 회화적인 한자의 자체와 그 독음 및 서사(간寫) 방법에서 오는 제약 대문에 산문에 있이서도 수사(修辭)가 강구되어 형식상으로는 시와 산문의 구벌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듯하다. 따라서 『시 경』 또는 〈시〉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들이 표현하고자 하였 던 〈뜻(志)〉이 란 무엇을 의 마 하는가 하는 문제 이다. - 물론 그 〈뜻〉에 대한 인식은 고대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2. 중국 고대의 〈시〉에 대한 인식 『시경』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서주(西周) 때의 시가들이 다. 특히 국풍(國風)에 실려 있는 15 국의 노래들은 모두가 본시는 민요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울 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사관)였고, 그 기록의 목적아 천자의 정치에 참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대부 계층이었던 기록자의 문장의식과 그 기록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나 용어가 많이 고쳐 쳤을 것이다 .10) 물론 그것은 서주시대에 민간가요를 수집 기목한 사람에 의하여 고쳐진 것분만이 아니라 동주(東周)에 이것들을모아 책으로 편찬한 사람과 또 이것을 베끼고 전하는 사람의 수정도 가 해져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공자 에 의하여 『시경』이 완성된 뒤에는 이것들은 기록분만이 아니라 암 송(暗踊)에 의하여 전해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기 록보다는 후세인의 개기(改記)가 적었을 것이다. 어떻든 본시는 문 학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시가가, 기록자들에 의하여 문 학보다도 정치자료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송(碩)과 아(雅)의 많은 작품들은 처 음부터 천자 궁전의 전례 (典禮) 에 쓰여진 것이므로 정치와 관련이 밀접한 것이었다. 다만 거기에 사용된 문자와 그 문자가 이루는 문장의 성격 때문에, 정치적인 굴 10下) 屈冊萬 참里조 .『) 論國風非民間歌臨的本來面 目 』(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渠刊』 第 34 本
이 면서 도 그 수사( 修辭)는 이 미 고도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 이 다. 서주 말엽의 혼란 때문에 동주 (東周) 로 들어와서는 이 Ii'시경』의 자료들아 노(魯)나라 관부 (官府 )에만 보전되고 있었던 듯하다. 사 마천 (司馬遷)은 Ii'사기 (史記)』 공자세 가(孔子世家)에 서 「옛 날에 는 〈시 > 3000 여편이 있었는데 , 공자가 그 중복되는 것은 태 버리고 예의에 합당한 것만을 취하여·… ··305 편(Ii'시경』)을 편찬하였다•j ll) 고 말하 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12) 오(吳)나라 계찰 (季札)이 노(魯)나라에 가서 주악(周樂)을 감상할 때 『시경射기 편차 (編次)가 다 갖추어져 있었고, 옛 전적에 인용된 〈시〉둘을 보면 현 재 Ii'시경』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극히 드물다는 이유 둥을 근거 로 「옛날에 〈시〉 3000 여편이 있었다.」는 설에는 의십을 표하였다. 그러 나 1i'논어 』 자한(子平)편에 서 공자 스스로,
11) 「古者詩三千餘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后稷, 中述殷周之盛, 至幽腐之缺, …• •• 三百五篇, 孔子皆弦歌之, 以求合部武雅碩之音. 」
12) 唐 孔類達 『毛詩正義』 및 方玉潤 『詩經原始』 등.
「내 가 위 (衛)나라에 서 노(魯)나라로 돌아온 (B.C. 484, 공자 68 세) 연 후에 야 음악이 올발라지 고 아(雅)와 송(碩)이 각기 제 자리 를 찾게 되 었다.」 13)
13) 「子曰 ; 吾自衛返魯, 然後樂正, 雅碩各得其所.」
고 말하고 있으니, 일단 공자가 Ii'시경』을 정리했음은 틀림없는 사 실이 다. 득히 정현(鄭玄, 127~200) 같은 이는 Ii'시보(詩譜)』에서 송 (碩) 가운데 노송(魯碩)과 상송(商碩)은 공자가 Ii'시 경 』 속에 끼 워 넣 온 것 이 라 주장하고 있다. 14) 그리 고 공자가 만년에 〈육경 (六經)〉을 만인을 위한 교과서로 책정한 이후에 1i'시경』은 비로소 경(經)으로 서 널리 읽히고 촌중되기 시작하였으니, Ii'시경伊 1 편자가 공자타 하 여도 잘못일 수는 없다.
14) 魯碩은 孔子가 魯나라 임금을 섬 겼기 때문이고, 商碩온 孔子가 商나라 사람 (.:z. 의 先祖는 .:z. 後孫의 나라인 宋나라에도 살았음)이었기 때문에, 天子의 周頭과 합 께 이들을 配列하였다는 것이다.
어떻돈 공자 (B.C. 551~B.C. 479) 에 의하여 Ii'시경』은 비로소 한 권 의 책 모양을 갖추고 춘추시대의 사대부들 사이에 읽히기 시작하였 다. 그런데 공자는 어떤 입장에서 『시경』을 사람들에게 읽히려 하
였고,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공자가 『논어』에서, 「『시경』울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 15) (爲政J
15) 「詩三百, 一言以萩之, 曰思無邪 . 」
「〈시〉에서 홍취를 일으키게 되고, 〈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되 고, 〈악〉에서 인간성이 이룩되게 된다.」(泰伯 ]16)
16) 「子曰 ; 興於詩, 立於禮,成於樂. 」
「〈시〉롤 배우지 않았으면 말할 거리가 없게 된다.」〔季氏〕 17) 「사람으로서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시경』의 편명)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는 마치 벅울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陽貨〕 18) 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브면, 공자는 Ii'시경』을 폭넓은 인간 의 십성 교육(心性敎育)의 자료로 생 각하였던 것 갇다. 그것 은 『시 경.!l에 실린 시들은 여러 면의 인간생활을 반영하고 있고 다양한 인 간의 서정을 노래한 것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17) 「不學誌 無以言. 」
18)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蘆面而立也與 ! 」 19) 「小子 ! 何莫學夫詩 ?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효, 可以怨. 還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
그 밖에도 공자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공부하지 않는가? 〈시〉는 사람의 홍 취를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사물을 올바로 살필 수 있게 하고, 사 람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게 한다. 가까이는 아버지를 섭걷 줄 알게 하고 멀리는 입금을 섬길 줄 알게 하며 , 새 침 승과 풀 나무의 이 름도 많이 알게 한다. 」 〔陽貨〕 19)
「『시경』울 전부 오J.다해도, 그에게 정치를 맡기었을 때 거기에 동 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전문적 인 웅대를 하지 못한 다면, 비록 많이 오J.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아 있겠느냐?」〔子路J 20) 는 등의 말도 하고 있다. 공자는 Ii'시경』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성격 울 순화해 주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고, 십지 어는 올바론 정치나의교활동을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춘추시대에 〈시〉가 자기의 감정을 표
20) 앞에 보임.
현하는 〈부시 (l 試詩)〉의 역할 이외에도, 궁정의 〈전례(典禮)〉와 의교 또는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간접적인 의사 표현수단으로도 쓰이 고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시〉의 효용을 강조한 것일 것이다 . 그러나 중국문학사상 본격적으로 협운(協韻)을 추구한 운문(g允文) 은 『시경』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수사기교(修辭技巧)도 이미 상당 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보기로 『시겅』 첫 머리의 〈관처(關雅)〉시를 읽어보자 . 0 0 靈唯鳩 在河之 ml. M 淑女, 君子好述 . 0 0 麟距低 麟流之· 첼뱉淑女, 藝堡求之 . 0 0 0 求之不得, 堡麗思服 悠莖堡팹 堡緖反側. 麟麟麟요. 輯淑女, 쪼홈戶之 . 麟麟· 益有죠 . 麟淑女, 鐘鼓樂之. 꾸록 꾸록 물수리논 황하 섭 속에서 우는데, 군자의 좋은 배필 아리따운 아가씨 그리네. 올망졸망마름풀을 이리저리 해치며 뜯노라니,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 자나 깨나 그리움네. 그리어도 얻지 못해 자나깨나생각노니, 그리움은 가이 없어 밤새 이리 뒤쳐 처리 뒤쳐 . 올망졸 망 마름풍을 여기저기서 뜯노라니,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와 금술 뜯으며 벗하고 싶네. 운망졸망 마름풀을
여기저기서 가려 뜯노라니,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와 풍악 울리며 줄기고 싶네. 이 시를 보면 ® 매 귀철이 네 자로 되어 있고. ® 압운(押韻)을 하 고 있으며 ( o 표), ® 수사학에 서 말하는 첨 자(莊字) • 첩 운(姓韻) • 쌍성(雙聲) 동의 기교가 다 동원되어 있으며(――표), ® 비슷한모 양의 굳자를 겹쳐 씀으로써 시각적인 수사효과를 더욱 드러내고 있 고 (=표), ®둘째, 네째, 다섯째 줄이모두대귀(對句)를이루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이미 [i'시경.J]의 문장도후세의 문학 못지 않게 수사를 통한 미(美)의 추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시경』이 처음 이루어전 춘추시대부터도 『시경』 온 〈경(經)〉으로서의 정치적 윤리적 공용성(功用性)이나실용적인 성 격 이외에도 수사를 동한 문학적인 마(美)의 추구라는 양면성(兩面 性)을 지니고 있었던 돗하다. 이러한 『시경』이 지니는 양면성은 후 세 중국문학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시경』온 공자의 제자들에 의하여 〈경〉으로. 존중되 며 읽 혀 졌 었 다. 『시 경 .J]을 〈경 〉으로서 촌중하는 유가(儒家)들 의 풍조는 결과적으로 전국시대에 새로운 시가의 등장이나 창작을 막아그기간을 시의 공백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전국시대 말엽 의 [i'순자(荀子)』에는 성상偉하접)편과 부 0 岡)편 같은 운문이 실려 있 다. 그러나 성상편의 노태들은 민요의 형식을 빈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선왕(先王)의 도(道)와 올바른 정치의 방법을 읊은 것 이 며 , 부편의 노래 들은 〈예 (禮)〉 • 〈지 (知)〉 이 외 에 도 〈구름( 雲 )〉 • 〈누에澤)〉 • 〈바늘頃t)〉 같은 것을 읊고 있으나 모두 예교( 綾 敎)나 윤 리를 가르치려는 내용이다. 끝머리에 붙어 있는 〈궈 1 시(低詩)는 더욱 교훈적인 내용이다. 이를 보더라도 공자의 제자들은 이미 전국시대 부터도 [i'시경』이 지니는 〈경(經)〉으로서의 의의에 압도되어, 그 속 에 표현된 더욱 다양한 인간의 문제나 수사(修辭) 같은 것은소홀히 하였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순수한 민요나 시는 그 문화권 안에서 는 행세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는 이미 남 쪽 의 초( 楚) 나타가 상당한국력과문 화수준 을 가지고 중 국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다행히도 초나 라를 중십으로한 남쪽의 이질적인 문화의 대두는 시에 있어서도 걷 국은 후세에 새로운 형식을 발전시키게 되는 처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秦 )나라는 분서 ( 梵참 )와 갱유(抗 儒 )를 단행한 왕조라 〈경〉으로 서의 『 시경』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 漢 ) 대에 들어오면 곧 유학( 儒學 )의 성행과 함께 『시경』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해석 되어 비로소 널리 지식인들 사이에 읽히게 된다. 서한 때에는 후 세 에 〈 삼가시 (三 家 詩 )〉라 불리 우는 『노시 ( 魯詩 )』와 『제 시 ( 齊詩 )』 • 『한시 (韓詩) 』의 세가지 해설이 『시경』의 해석과 연구의 주류를이루 었다. 『 노시 』는 노 (魯) 나라의 신배 ( 申培 )라는 한나라 고조( 高 祖) 때 부터 무제 ( 武 帝 ) 때 에 이 르기 까지 활 약한 학자가 부구백 ( 浮 丘伯)이 란 스 승 에 게 서 『시 경 』을 배 워 전한 것 이 다. 21 ) 그는 『노고( 魯 故)』 25 권을 지었고, 문제(文帝) 때에는 『 시경 』 울 공부했다하여 박사(博士)가되 기도 하였다 하나 , 2 2) 관운은 불우하였고, 만년에는 노나라에서 많 은 제자들울 가르치어 제자 중에 서한 때 박사가 되었던 사람이 십 여명이라 한다.
21) 『 漢합 』 儒林傳 참조. 아래 敍 固 • 韓 製의 生平도 강움.
22) 宋 王 應麟 『困 學紀 1l!J』 卷 8.
『제시』논 제( 齊 )나라의 원고( 結 固)라는 사람 2 “ 이 전한 것이다. 그 도 『시 경 』울 공부한 덕 에 경 제 ( 景 帝 ) 때 에 박사라는 학관( 學 官)에 올 랐었으나, 두태 후(災太后)가 황로지 학( 黃 老之 學 )을 좋아하던 터 이 라 관운은 역시 불운하였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어 제( 齊 )나 라에서 『시경』으로 이름을 날린 학자둘이 그 중에서 많이 나왔었다.
23) I삼 顔 師 古의 『 漢안』 狂 文‘량 . 의 注에서는 齊詩 를 后 蒼 이 전했다하였다. 『 漠한 』 儒 林 {상 에는 그에 관한 傳記 가 있고, 칼 은 藝 文志에는 그의 著한 로 『齊 后氏傳 』 과 r 齊 后氏故 』 가 있어 그 렇 게 분 수도 있을 듯 하다 .
『한시』는 연( 燕 )나라 사람 한영( 韓 要)이 전한 것이다. 그는 문제 (文帝) 때에 박사가 되었었고, 경제( 景 帝) 때에는 상산왕(常山王)의 대부(太傅)를 지냈다 한다. 그는 『시경』울 연구하여 『내전(內傳)』과
『의전(外傳)』을 지 었는데 , 이들 삼가(三家)의 처술 중 지금은 『한시 외전(韓詩外傳)』만이 전한다. 24)
24) 近人 楊樹達온 『漢찬補注補正.!I에서 그의 『內傳』은 지금의 『外傳』속에 합쳐져 전 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 무제 (武帝)는 학관(學官)으로 오경 박사(五經博士)와 제 자원 (弟子員) 50 명을 두었는데 , 이로부터 유학(信學)이 크게 성행하여 학 관의 인원수가 소제 (昭帝) 때에는 100 명 , 선제 ( 宣 帝) 때에는 다시 그 두배로늘었고, 원제(元帝) 때에는 1000 명으로 늘어난 이의에도군국 (郡國)에 도 또 오경 백 석 졸사(五經百石卒史)들을 두었으며 , 성 제 (成帝) 때 에 는 3000 명 으로 늘어 , 이 후 유학은 2000 년의 역 사를 통하여 중국 의 정치원리와사회윤리의 바탕을 이루는중십 학문으로발전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이들 〈삼가시〉도 많은사람들이 공부하고 읽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시경』은 이 ' 〈삼가시〉가 아니라 한 나라 초기 하간현왕(河間獻王)의 박사를 지 냈다는 조(趙)나타 사람 모공(毛公 )2” 이 전한 『모시 (毛詩)』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모시 (毛 詩)』 29 권과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 30 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 그 중 뒤의 것이 우리에게 전해전 가장 오래된 『시경』의 판본이며 그 해설서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삼가시〉로 『노고(魯故)』 25 권, 『노 설(魯說)』 28 권, 『제후씨고( 齊 后氏故)』 20 권, 『제손씨고(齊孫氏故)』 27 권, 『제후씨전(齊后氏傳)』 39 권, 『제손씨전(齊孫氏傳)』 28 권, 『제 잡기 (齊雜記)』 18 권, 『한고(韓故)』 36 권, 『한내전(韓內傳)』 4 권 • 『한 외 전(韓外傳)』 6 권 , 『한설 (韓說)』 41 권 둥이 수목되 어 있 다. 그러 나 『제시』는 위(魏)나라 때에 없어졌고, 『노시』는 서전(西晋) 때에 없 어졌다. 『한시』는 당매f)나라 때까지도 전해졌었으나 ,26) 곧 없어 지고 지금은 『의전』만이 전한다. 27) 이처 럼 서한 때에 성행한 〈삼가 시〉가 모두 후세에 전하지 않게 된 것은, 〈삼가시〉를 공부한 학자들
25) 『漢합』 藝文志와 儒林傳에는 〈毛公〉이 란 姓만이 보이 나, 鄭玄의 『詩譜』에는 魯 人 大毛公과 小毛公이 있었다 했고, ’ 陸環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I에는 大毛公은 毛亨으로 『話訓傳』을 지었고, 小毛公 毛哀이 그것을 傳授받았다 했는대, 모두 믿 율수 없는記錄둘이다.
26) 宋 王應麟 『詩考』에서 인용한 『崇文總 目 』에 따로면 北宋 때 까지 도 전해 지 고 있 었던 듯하다. 27 ) 지금 『申培詩說』이 전하나 明대 豊佑의 僞作입이 확실하다.
은 학관으로 출세하는 대신 〈경(經)〉을 빌어 그 시대의 정치원리를 설명할 팔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Ii'시킹 』 연구는 그런 목적에 맞도록 시의 대의를 억지 해석하는 데 노력이 기울여졌기 때문이다. Ii'한서』 예문지에서도 이미 〈삼가시〉는 「혹은 『춘추』에서 취하기도 하고 잡설(雜說)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그 본뜻이 아니다.」 28) 고 비평하고 있고, 특히 Ii'제시』에는 음양오행설(陰腸五行說)까지도 많이 동원되고 있었다 한다 .29) 이러한 그 시대 정치상황의 설명을 위한 시의 대의(大義) 파악은 곧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거의 가치 없는 게 되고 말기 때문에 〈삼가시〉는 일찌기 전하지 않게 되었던 것아다. 거기에 비하여 『모시』는 서한 때 학관에 오르지 못하여 비 교적 착실한 훈고(訓話)에 노력하고 있고, 동한 때에 Ii'모시』를 보충 해설한 『전澤)』을 쓴 정현(鄭玄) 같은학자가 나오기도했기 때문에 Ii'모전』이 유일하게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28) 「或取春秋, 采雜說, 咸非其本義. 」 29) 『漢완』 翼奉傳에 보이 는 〈五際〉의 理論 갈은 것 .
그렇지만 『모시』의 해설도 시를 〈경(經)〉으로서 이해하며 정치를 하는데 팔요한 용구처럼 해석하는 방향울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우선 시 의 대 의 (大義)를 설명 한 『모시 』 서 (序 )30) 를 보더 라도 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30) 지금 傳하는 『毛詩』에는 앞머리에 〈大序〉가 있고, 각 詩의 앞부분에는 그 詩의 大意문 설명한 〈小序〉가 있다. 그 작자는 孔子·子夏·毛公·衛宏동 여러 說이 있 으나 모두 證抵가 확실치 않으며 , 漠人의 詩說이라 보면 크게 문립 없을 것이 다.
「치세(治世)의 음악은 편안하면서도 즐겁고 그 정치는 조화를 이 루며 , 난세 (亂世)의 음악은 원망스럽고도 노여움고 그 정치는 도리 에 어긋나며, 망국(亡國)의 음악은 슬프고도 애룻하고 그 백성들은 곤경에 빠진다. 그러므로 정치의 잘찰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 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시〉보다 더 좋은 계 없다. 선왕들 은 이것으로써 부부사이를 다스리고, 효도와공경을 이룩하였으며, 인문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풍속을 훌륭하게 이끌 었다.」 31)
31)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 亂世之昔, 怨以怒, 其政乘 ; 亡國之音, 哀以思, 其 民困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 敎化, 移風俗.」
곧 음악은 그 시대상을 무엇보다도 찰 반영하는 것이며, 사람뿐 만이 아니라 천지와 구1 선까지도 감동시키는 험아 있는 것이어서, 그 가사인 〈시〉는 정치에 가장 훌륭한 용구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풍(風)이란 바람(또는 풍자)의 뜻이요 가르친다는 뜻이니, 바람 과 같음으로써(또는 풍자함으로써) 감동시키고, 가르침으로써 강화 시키는 것이다.」 32)
32) 「風, 風也, 敎也 ; 風以動之,敎以化之. 」
「임금은 풍(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백성은 풍으로써 임금을 풍자하는 것인데, 수사를 위주로 하여 간접적으로 간(練)하기 때문 에 말한 사람은 최가 없고 듣는 사람은 경계하기에 족하게 되는 것 아 다. 그러므로 풍이라 하는 것이다.」 33 ) 논 동의 말도 하고 있다. 곧 앞의 15 국의 민가를 모아 놓은 부분을 〈풍(風)〉 또는 〈국풍(國風)〉아 라 부르는 까닭은 그 시 들이 풍자(誤刺) 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풍자는 정치적으로 임 금의 잘못을 간하거나 백성들울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모 시』에서도 칭치와의 밀접한 관련 아래 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3 )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認값t, 言之者無罪, 聽之者足以戒, 故曰風. 」
그분 아니 라 『모시 』 서 (序)에 는 [j'시 경 』 중에 는 정치 가 올바로 행 해 지던 시철에 지어전 〈정시(正詩)〉와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지어전 〈변 풍(複風)〉과 〈변아頃環)〉가 있다는 이론도 보인다. 이는 〈풍〉과 〈아〉 속에 들어 있는 연애시와 사회의 모순을 노래한 시 같은 작품이 〈경 (經)〉 속에 들어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리 고 여 기 에 서 논하고 있 는 〈시 의 육의 (六義)〉 34) 나 〈사시 (四始)〉 35) 같은 이론도 시의 본뜻과는 관계없이 『시경』을 거창하게 보이도록 해석하려는 데서 나온 이론이라 할 것이다.
34) 『毛詩』 序에 〈風.賊·比.典·雅·碩〉이 六義라 하였는데, 〈風.雅·領〉은 詩 의 種類이고, 〈試•比·興〉은 詩의 表現方法이니, 六義라 하여 한데 묶어 큰 뜻이 담긴 原理인듯 내세울 理由가 없다.
35) 〈四始〉는 風 • ,J、雅 • 大雅 • 碩의 첫 머 리 詩 四篇울 말한다고도 하고 (『史記』 孔子 世家), 『齊詩』에서는 五行說을 인용하여 알기 어려운 說明을 하고 있다.
『모시』의 이러한 시에 대한 기본 입장 때문에 걷국 시의 해석도 이러한 방향을 따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앞에 인용한 『시
겅』 첫머리의 〈관저 C m 湘祖)〉시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젊은 남자 (君子)가 아름답고 양전한 숙녀 (窮窮淑女)를 그리 는 연정 (戀情)을 노 래한 것인데 ,36) 『모시』에서는 「후비 (后妃)의 덕을 노래한 것」이타 해석하고 있다. 〈후비〉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비 (妃)인 태사 (大姬)를 가리킨다는 것이며, 이에 뒤이은 주남(周南)의 시들은 〈후 비의 덕〉이 문왕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 지는 일관(一貫)된 내용을 노래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 번째 〈권이 (卷耳)〉 시 같은 것 도 분명 히 역 사(役事)에 끌려 나간 남자 가 집을 그리는 시인데도, 『모시』에서는 〈후비의 뜻〉을 노래한 것 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 〈뜻〉이란 어전 이불 구하여 남편에게 추천 하려는 성의를 말한다 한다.
36) 屈萬里 『詩經擇義.!l에서는 祝婚詩로 보고 있다.
도꼬마리 뜯고 또 뜯어도 납작바구니 에 도 차지 못하네. 아아, 내 그리운 님 생각에 바구니를 · 한길에 내던지네. 높은 산에라도 오르려니 내 말 병이 났네. 에타, 처 금찬에 술이나 따라 기나긴 수십 잊어볼까! 높은 언덕에라도 오르려니 내 말 병들었네• 에라, 처 쇠뿔 찬에 술이나 따라 기나긴 시롬 잊어볼까! 돌산에타도 오르려니 내 말 지쳐 병났고 내 하인 발병났으니 그대 있는 곳 바라보지도 못하는가! 采采卷耳, 不盆傾篠.
陸我懷人, 直彼Ji'Jn-. 涉彼崔鬼, 我 馬鹿 限. 我姑酷彼金 w, 維以不永 w. 涉彼 高 岡, 我馬玄黃. 我姑酷彼兒照, 維 以不永傷. 涉彼沮矣, 我馬梧矣, 我僕蒲矣, 云何呼矣! 이 밖에 도 짝사랑을 노래 한 〈한광(漢廣)〉은 후비 의 「덕 이 널리 미 천 것」, 님그리움을 노래한 〈여분(汝壤)〉은 후비의 덕을 바탕으로 하여 문왕의 「도(道)에 의한 교화가 행하여지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 고 있다. 그리고 둘째번의 소남(召南)의 시들은 또 모두가 「부인(夫 人)의 덕」을 체계적으로 노래한 시들로 억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변풍( 變風 )이나 변아(變雅)라고 생각하였던 시들은 전부를 여지 해석하는 수가 없어 그 시대의 일들을 풍자한 것으로 둘러대고 있다. 『모시서』에서 「학교가 패한 것을 풍자한 것」 3” 이라 설명한 정풍(鄭風)의 〈자금(子裕)〉 시를 보기로 돈다.
37) 「刺學校廢也. 亂世Ji ll 學校不修焉. 」
파란 님의 옷깃이여, 내 마음에 시품 끝없네. 비록 내가 못 간다 해도 그덴 어찌 소식도 없는가? 파란 님의 패욱 끈이어, 내 그리움 끝이 없네. 비록 내가 못 간다해도 그덴 어찌 와 주지 않는가? 어술렁 어슬렁 성문 앞 서성이는데. 하루만 못 만나도 석달 못 본 듯하네.
靑靑子裕, 悠悠我心. 縱我不往 , 子寧不嗣音? 靑靑子偶 , 悠悠我思. 縱我不往, 子寧不來? 挑分達分, 在城朋分. 一日不見, 如三月分. 이 시를 학교문제에 갖다 분이기 위해서 〈파란 옷깃〉을 옛날 〈학생 들이 입던 옷깃〉이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현(鄭玄, 127~200) 은 『전 (愛)』 에서 이 시의 멘 끝 장( 華 ) 첫 두 귀와 끝 두 귀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붙이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사람들은 학업을 폐하고 다만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여, 성궐에 나타나 바라보는 것으로써 낙울 삼았던 것이다. 」 38)
38) 「國亂 人廢學業, 但好登高 見於城1\1!, 以候望爲樂. 」
「군자의 학문은 굳로써 찬구와 만나며 찬구로써 인(仁)을 보충하 는 것인데, 홀로 배우며 찬구가 없다면 의롭고 고루해지며 듣는 게 적어진다. 그러므로 그토록 십히 그리는 것이다.」 39l 끝 장을 정현의 이 설명대로 해석하고 보면 이 시가 어떤 꼴이 되 는가? 제풍(齊風)울 예로 들어 보면 『모시』 서에서는 첫째 시를 「현 바 (賢妃)를 생 각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의의 나머지 10 편을· 모두 「 ...... 울 풍자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Ii'삼가시』는 Ii'모시』에 비하 여 더욱 비뚤어전 해설울 하였으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대의 학자 둘은 모두 이러한 도학적데[學的)인 해시(解詩) 경향에서 조금도 벗 어나지 못하였다.
39) 「君子之 學 , 以文會友, 以友 幅 仁, 獨學而無友. R IJ孤柄而효聞, 故思之&. 」
이처럼 Ii'시경』을 〈경〉으로서 억지 해석을 하는 한대 학자들의 태 도는 이후의 중국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이를 근 거로 다른 종류의 시 해설에까지도 이러한 수법이 그대로 적용되 었기 때문이다. 예로 양(梁)나라 소통(蕭統, 501~531) 이 편찬한 『문 선(文選)』 권 29 에 실려 있는 작자를 알 수 없는 〈고시십구수(古詩十
九首)〉중의 첫 수룹 읽 어 보자. 가고가고또가고가 님과 생이변하였네. 서르 만여리나 떨어져 각각 하늘 한 끝에 있게 되었지. 길온 립하고도 머니 만날 날 알 수도 없네. 복녘 오랑캐 말은 북풍에 기대고 월(越)나라 새는 남쪽 가지에 둥우리친다 했네. 떠나간 지 오래 됨에 따라 허리띠는 날로 느슨해지네. 뜬 구름 밝은 해률 가리었으니 떠나간 이는 돌아올 업두도 못 내내. 님 생각은 사람만 늙계 하는데 세월은 어느덧 처물어 가네. 다 잊어버리고 다신 생각 말고 밥이나 많이 드시도록 힘쓰시기를 ! 行行重行行, 與君生別離. 相去萬餘里,各在天一珪. 道路沮旦長, 會面安可知? 胡馬依北風, 越鳥災南枝. 相去日已遠, 衣帶日已緩. 浮 雲 薇白日, 游子不顧返. 思君令人老, 歲月 忽已晩. 棄損勿復道, 勢力加倭飯. 이것은 분명히 떠나간 님을 그리는 여인의 노태이다. 그러나 당(唐) 대 의 Ii'오신주(五臣注)』에 서 장선 (張銃)은 「이 시 의 뜻은 충신이 간사한 자들의 참해 (臨害)불 받아 쫓겨 난 것을 읊은 것.」 ~0) 40) 「此詩;fl;, 爲忠臣遣侯人 誤 讚, 見放逐也 . 」
이라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뜬 구름(浮宏)」은 간사한 자들울 가리 키고 「맑은 해(白日)」는 임금을 가리키며〔劉良 社〕’ 「님(君)」이란 임 금을 뜻한다〔李周翰 注)고 보고 있다. 〈고시십구수〉의 시가 거의 모 두 님 그리는 노래인데도 당(唐)대 학자들은 그러한 해석울하고 있 는 것이다. 도학자들은 사대부들의 굳에 이런 사랑이나 그리움 같 은 것을 노래한 굳이 있어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둘러대기식의 시 해석은 한편 시인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사랑의 노레를 부를 수 있게도 만들었다. 사랑이나 그리 움을 노래불러 놓고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나 「임금에 대한 충 성십을 노래한 것」이라 둘러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운 리를 지배한 유가(儒家)들이 그처럼 도학자적인 문학관을 지녔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문학이 서정시(行情詩)를 중십으로발달하고 또그 서정은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 중십울 이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거의 모든 중국의 시인들이 모두가 사랑의 시를 몇 편씩 은 짓고, 묵히 아름다운 여인이 화려한 규방에서 외로이 떠나간 님 을 그리는 애철한 서정을 노래한 규정시(闇情詩)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시경』에 이마 그러한 시들이 적지 않게 둘어있는데다 그 해 석은 예교(禮敎) 윤리에 언제나 두드려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시경』의 내용 『시경』은 모두 305 편의 시들이 크게 국풍(國風) • 소아(小께t) • 대 아(大雅) • 송(碩)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실려 있다. 옛날에 혼히 『시경』을 〈시삼백(詩三百)〉이라 부른 것도, 『시경』에 실란 시의 편 수가 대략 300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모시』 가운데에는 「그 뜻은 촌재하되 그 가사는 없어전」 6 편의 시가 제목만이 남아 있 다. 『모전(毛傳)』 • 『정전(鄭燮)』 등에선 그 가사가 전국시대에 없어 진 것 이 라 하였으나 주희 (朱熹, 1130~1200) 는 『시 집 전 (詩 菓 傳)』에 서 이것들은 본시 가사가 없는 생가(笛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풍〉 속에 는 주남(周南) • 소남(召南) • 패 01:1 1) • 용(jffll) • 위 (衛) • 왕(王) • 정 (鄭) • 제 (齊) • 위 (魏) • 당(唐) • 전(秦) • 전(陳) • 회 (檜) • 조(曹) • 빈(l!l!l)의 15 국의 민요들이 모아져 있다• Ii'모시料분 비롯하여 옛 날 학자들은 여 기 의 〈풍(風)〉자는 〈풍(謨)〉자와 통하여 〈풍자(誤 刺)〉 또는 〈풍유(誤諭)〉의 뜻을 지닌 것으로 풀이하였었다 .41) 그러 나 〈대 아〉 숭고(炭高)시 끝머 리 에 서 걷보(吉甫)가 노래 지 으니 그 가사 매우 위대하네. 그 풍(風)이 아주 좋기에 이것을 신백 (申伯)에게 바치 네. 4l) 앞의 『毛詩』 序 引用文 참고.
吉 T t}(午踊, 其詩孔碩 其風陣好, 以贈申伯. 하고 노래 하고 있으니 , 여 기 의 〈풍(風)〉은 바로 〈 노래 〉나 같은 뜻의 말임에 틀림 없다. 그러니 〈 풍〉은 처음부터 지금 중국말의 〈 풍요 (風話)〉 , 곧 민간가요의 뜻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 풍 〉 에 〈 국 〉 자를 덧 붙이 어 〈국풍〉이 라 부르는 습관은, 그것 이 〈여 러 나라들의 노래 〉 라는 뜻에서 전국시대 말엽부터 시작된 일인듯 하 다. 4Z)
42) 대체로 『荀子』 大略핀에 「園風之好色也… ... J하고 말한게 가장 오태 된 用例인듯 하다.
〈국풍〉 중에 서 도 첫 머 리 의 〈주남〉과 〈소남〉에 대 하여 는 『모전』 • Ii' 정전』 등 중국의 전통적인 옛 학자들은 모두 주(周) 나타초기에 지 어진 정풍(正風)이라 하여 이룰 매우 촌중하였다. 그리고 주(周) 문 왕(文王)이 도읍을 풍(豊)으로 옮긴 뒤 옛 주나라의 기 (岐, 陝西省 岐 山縣 부근) 땅을 둘로 쏘개어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召公奭)에게 각각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들의 교화가 그 남부지방에까지 미치어 거기에서 노태 불리어지던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이 〈주남〉과 〈소남〉 이 라 하였다. 그러 나 근인 부사년(傅斯年)은 그의 Ii'주송설價]碩說)』 43) 에서 「남은 남방의 나라를 뜻하며, 〈주남〉은 주나라 왕조에서 직할 (直轄)하던 남방의 나라를 뜻한다」 하였 다. 그리 고 또 「〈소남〉은 소 목공호(召 穆公虎 宣 王때, B.C.827~B.C. 78 0, 사람)가 동할하던 남국 울 말한다」 하였다. 옛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이 주남과 소남은 주 나라 초기의 시여야만할 것이나, 〈주남〉 여분(汝境) 시에는 「왕실이 불타는 듯하다」(王室如殿)는 따위의 혼란한 세상을 반영하는 시귀가 있고, 〈소남〉 하피농의(何彼 樣矣) 시에는 「평왕의 손자」(平王之孫)란 구1 절이 보이니, 이 시는 동주 초기의 작품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 주남〉 • 〈소남〉의 시 들 중에 는 한(漢) • 여 (汝) • 강(江) 동 남방의 강 물 이름이 보이는데, 그 남쪽 지역이 중국 문화권으로 등장하는 것 은 서주의 후기이다. 그리고 〈소남〉 감당(甘梁) 시에 보이는 소백
43) 中央硏究院 『鹿史語言硏究所渠 T4 j.!I 第一本 二分 (1930).
(召伯)도옛날엔 소공석(召 公奭) 이라 하였으나 굴 만리 (屈I~里) 교수는 『시경석의(詩經 釋義)』 에서 그가 소공호(召公虎)임을 증명하고 있다. 남송(南宋) 초기 의 왕질 (王傾)과 정 대 창(程大昌) 같은 학자들은 주 남 • 소남의 〈남〉이 악명 (樂名)이 므로, 44) 아(i t) • 송(碩)같이 (국풍〉 과는 독립된 성격의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 뒤로 고영무 (顧炎武 , 1613~1682)45) 둥 많은 학자들이 이 에 찬 동하였고, 근래 엔 풍완군(馮 玩君) • 육간여 ( 陸何如) 가 공처 한 『중국시 사(中 國詩史)』 등이 이 설을 따르고 있 다. 그러 나 위 원 (線源 , 1794~1856) 이 『시 고미 (詩古 益t)』 에 서 지적했듯이 『좌전(左傳)』 은공(t앙公) 3 년에 「 〈풍〉 에 채 번 (采~) • 채빈 (采 5h ) 이 있다. 」 하였는데 , 채번과 채빈시는 소남에 있는 작 품 이름 이므로, 주남과 소남이 모두 〈국 풍〉이었음이 분멍하다. 그러나주남 과 소남이 나타 이름아 아님은 분명하며, 또 〈 남 〉 이 〈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건 그 지역 특유의 음악 이 있었을 것이니, 간혹 그 지역의 특성운 지닌 음악 이릅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46 ,
44) 王팠 『詩總問』 卷一, 程大昌 『考古編』 卷-에 서 모두 小雅 鼓鐘에 서 「以雅以南」 이 라 하였 고, 『 左傳』에 서 季:t= L 이 觀樂할 때 댜안節南篠.!l 이 있 다는 것 을 根拍로 하 고있다 .•
45) 『 n 知錄』 卷 三 四 詩
46) 『左傳』 成公 九年엔 픕 나라에서 楚 나라 捕멈 t 가 〈南音〉을 연주했다는 記錄 이 있고, 칼은 襄公 九年엔 師談이 〈北.!B.〉과 〈南風〉윤 노래 하는 데 관한 말을 하고 있다 .
이 밖에 〈국풍〉 중의 패 Ot!S ) • 용(fiill) • 위 (衛)의 세 나타 노래 들은 모두가 위풍( 衛風) 이라는 데에는 옛날부터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 다. 47) 따라서 15 국 중에 서 확실한 나라는 결국 11 국이 다.
47) 鄭 玄 等 古人은 j5 • 페F • 衛 가 周初의 三 IJi.운 에게서 나왔다 하였는데(『 詩ii}』) , 魏 際 온 jlil • 郞 • 衛가 一地名이라 하였고(Ii' 詩 古 微』 卷 三), 王 國維 는 j敗는 뒤의 암운 나 라 땅이고 1li11은 뒤의 魯나라 땅에까지 걸친 地 域 입을 考證하고 있다(『 觀堂渠林』 卷 十五北伯鼎跋).
그런데 이 〈국풍〉의 시들이 지어전 연대는 가장 빠론 것이타 하더 라도 서기 기원전 9 세기를 넘지 못하며 , 동주 초기의 시가 가장 많 은듯하다. 다만 〈국풍〉 중 그 지역이나 처작시기에 대하여 이론이 가장 분분한 것 이 빈풍( 幽風) 이 다. 특히 치 효( 明gg) 시 는 『서 경 ( 집t經 )』 금등( 金脈 )편에 주공( 周公) 이 부른 노래 라 기 록되 어 있고, 동산( 東
山) • 과부(破%)도 『모전 』 등 옛 날 학자들의 해 설은 오두 주공동정 (周公東征)과 관계가 있는 시이며, 나머지도 모두 주나라 초기의 노 레 로 보았었다. 그러 나 『서 경』 금둥편도 춘추 만년이 나 전국 초기에 전설을 근거로 쓴 글인듯 하며 , 나머지 작품들도 주공단(周公旦)과는 직접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48) 이 시들의 문장을 보더라 도 주나라 초기 의 작품이 라 생 각되 는 〈 주송(周碩)〉이 나 〈대 아(大雅)〉 중의 일부 작품들이 까다롭고 읽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모두가 너 무나 매끄럽고 평이(平易)하다. 따라서 〈빈풍〉도 동주 초기의 작품 임이 들림없을 것이다. 15 국풍의 지역도 북쪽은 연( 燕 , 河北, 山西) 나라, 서쪽은 전(秦, 陝西), 남쪽은 장강(長江) 유역에 이르는 춘추 시 대 강역 (副域)과 거 의 같은 듯하다.
48) 傅斯年 『周碩說』(中央硏究院 『底史語言硏究所菜刊』 第一本 一分, 徐中舒 li'!lm風 說』 (上同 第六本 四分), 馮玩君 • 陸何如共著 『中國詩史』 卷一 古代詩史 篇二詩經 등참조
〈아(雅)〉에 대 하여 양계 초(梁啓臨 1873~1929) 는 『석 사시 명 의 (釋四 詩 名義)』에 서 , 〈아(雅)〉자는 옛 날에 는 〈하(夏)〉자와 서 로 통용되 었으 니 ~9) 〈 아 〉 는 중원 (中原) 인 하(夏) 지 역 에 유행 하던 정 성 (正聲)의 노 래를 뜻한다 하였다. 이것은 물론 주나라 왕조에서 숭상하고 상용 하는 음악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49) 『荀子』 榮辱篇에선 「符之越人安越, 楚人安楚, 君子安雅.」라 했고 갈은 책 儒效 篇에선 「居楚而楚, 居越而越, 居夏而夏 . 」라 했으니 , 雅 • 夏가 通用되 었다. 또 다물 子』 天志下篇에선 〈大雅〉 皇矣시의 詩句룬 引用하며 〈大夏〉라 하였고, 『左偏.!I에 보이 는 꾸 f大夫 〈子雅〉를 『韓非子 』 外偉說 右篇에선 〈子夏〉라 한 것 등도 그 증거 임 •
그런데 어떻게 이 〈아〉가 〈소아〉와 〈대 아〉로 나뉘어져 있는가? 주희 (朱蒸 1130~1200) 는 『시집전(詩菓傳)』에서 〈아〉에도 〈변아復명 雅)〉와 〈정아(正雅)〉가 있다고 구분하고 나서, 「〈정 소아〉는 찬치 하고 즐길 때 의 음악이 요, 〈정 대 아〉는 회 조(會 朝)에 쓰이던 음악이요, 벼슬을 받을 때 훈계를 늘어놓던 말인 것 이 다. 」 50) 고 하였다. 실제로 〈소아〉와 〈 대아〉에 실린 시들의 내용을 보면 이 주회의 설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중거가 있는 것
50) 「正小제 용 , 燕 喪之樂也 ; 正大뀜 t , 압朝之樂, 受 t it t的! 戒之辭也. 」
도 아니 다. 득히 〈 소아 〉 속 에 는 황 조 (黃鳥) • 아행 기 야( 我 行 其 野 ) • 곡 풍(谷風) • 하초불황(何 華 不 黃) 등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평과 님그리움을 노래한 〈 풍 〉 에 가까운 시들과 적지않은 풍 자시들이 있고, 〈 대아 〉 속에도 여러 편의 풍자시가 있으니, 이것들 율 궁중의 행사에서 노래불 렀 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결 국 〈 아 〉 는 중원지역에 유행하던 노래들이어서 궁중의 행사나 전례 ( 典 祿) 에 쓰이던 음악이 중십을 이루지만 그곳 민간의 가요들도 함께 섞여둘 게 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물 보면 〈 풍 〉 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중원의 음악들은 그 가락이 15 국의 〈 풍 〉 과는 달랐기 때문에 〈 소아 〉 나 〈 대아 〉 에 끼게 된 것이타고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 소아 〉 와 〈 대아 〉 의 내용 을 보면, 주나라 초기 선조들의 공덕 과 개 국 (開國 )을 하던 성 세 ( 盛世)를 기 란 내용의 시를 〈대아〉라 하고, 서주가 쇠미해 가던 때의 시를 〈 소아 〉 라 한 듯도 하나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아〉는 〈국풍 〉 과는 달리 사대 부들이 지 온 것 으로 생 각되 는 시 들 이 대부분이어서, 내용도 서정(打情)적인 작품보다는 궁 중 의 연회에 서 부르던 손님을 즐겁게 하는 작품, 임금이나 어떤 일을 송축 (碩 祝) 하는 내용, 어떤 사람이나 일을 풍자하는 것, 제사 때 쓰던 노래의 가사 등 전례(典 禮 )와 관계가 있논 것들이 많다. 전쟁이나 행역(行 役)과 관계된 시들도, 〈국풍 〉 의 경우처럼 님그리움 또는집생각을노 래하는 경우도 있기는하지만 전체적으로볼때 훨씬 서사적(敍 事 的) 인 성 격 을 떤 작품이 많다. 이 것 은 〈소아〉의 작품이 〈 국풍 〉 보다는 더욱 형석화하여 생동하는 표현이 줄어들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 리 고 옛 날 학자들은 〈정 소아(正小雅)〉는 모두 주나라 초기 의 작품이 라 하였으나, 실상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작품은 거의 없으며 대부 분이 서주 말엽의 작품 51) 이며 동주 초엽의 작품도 들어 있다. 〈대 아〉는 대 부분이 축송(祝碩) 찬미 (殿 美 )하는 내 용과 제 사( 祭 祀) 연음( 燕 飮)에 관한 시이고, 나머지도 모두 교훈적인 내용이 담간 것 들이다. 이는 〈소아〉보다도 〈대아〉의 내용이 훨씬 더 형식화하고 51) 周 宜王 (B.C.827~B . C . 782 在位) 및 유왕(幽王, B. C. 7 81~B.C. 77 1) 때의 작품 이 가장많은듯하다.
있음을 뜻한다. 〈대아〉의 시들 중에는 서주 초년의 작품이라 생각 되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서주 말엽의 작품둘안듯 하다. 그러 나 〈대 아〉의 서 주 초의 작품이 라 생 각되 는 것 도 주송(fiil碩)에 바 하 면, 편폭(篇幅)도 길고 체재와 문장 기교에도 차이가 나며, 용운Ofl 韻)도 훨씬 정제(整 齊) 하니 후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대아〉의 시들은 표현아 너무 추상적이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만 서사적(奴事的)인 기법의 발전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경』 중 가장 건 작품이고 풍자적인 내용이 담건 상유 (桑柔) 같은 시를 보면, 앞 뒤의 짜임새가 빈몸이 없는 정도이니 상 땅한 문장 수련을 쌓은 사람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다만 이런 시들에도 추상적인 설교(說敎)가 너무나 많다는게 큰 홈이타 할 것이다. 〈송(碩)〉에 대하여는 완원(阮元, 1764~1849) 이 본시 〈송〉은 〈용 (容)〉의 뜻이 있었으며, 〈용〉은 형용(形容)을 뜻하고 다시 그것은 무 용(舞 容) 과 통하여, 〈송〉은 〈충이 곁들여 있는 노래〉란 뜻에서 나 왔다 하였다. 〈성덕(盛德)을 찬미하는 것〉이란 해석은 뒤에 생간 여 의 (f斜 義) 라는 것 이 다. 52) 이 뒤 로 왕국유(王國維 )53) • 양계 초(梁啓超 )54) 둥이 이 설을 더욱 발휘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52) 『京經室一菜』 卷一 澤碩
53) 『裁堂染林』 卷二.
54) 『擇四詩名義』(『小說月 報』 17 卷 號外 『中國文學硏究』 上冊).
그러 나 『시 경 』의 〈송〉 전체 가 무가( 舞歌 )라고 우겨 서 는 안된다. 〈 송〉이 란 말이 아무리 〈무용(舞容)〉에 서 나왔다 하더 라도 특히 후세 에 지어전 노송(魯碩) • 상송(商碩) 같은 것은 꼭 충과 관계있는 것 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주송(周碩)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제가(祭歌)인데, 제가는 옛날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본시 춤과 밀 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송〉은 『시경』 중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이미 전국시대부터 서주 초년의 작품이라 생각했던것 같다 .55) 그리고 왕국유(王國維 0 가
55) 『左傳』 宜公 12 年 ; 「楚子曰 ; 武王克商, 作頭曰 : 〈載跋干戈 •••• ••〉 (引時速之末五
句). 又作武, 其卒章曰 : 〈耆定爾功〉 (見於武), 其三曰 : 〈옵fi時線思, 我祖維求定〉 (見於費), 其六曰 : 〈緩萬邦, 歷豊年〉(桓之首兩句). 」 『國語』 周語上 : 「周文公之領 曰 ; 〈萩戰干戈〉.J
호천유성 명 (昊天有成命) • 무(武) • 작(酷) • 환(桓) • 뢰 (費) • 반(般)의 여섯 편이 〈대무무(大武舞)〉라는 둥의 고증을 시도하고 있듯이 56), 거의 모돈 학자들이 이 중 대부분이 서주 초의 시라 보고 있다. 어 떻든 이 〈대무(大武)〉에 관계되는 시들이 『시경』 중에서도 가장 초 기의 작품일 것이며 , 나머지는 성왕(成王, B.C.1115~B.C.1079 재위) 때의 작품이 가장 많은 듯하고, 시 중에는 태왕(大王) • 문왕(文王) 올 비롯하여 무왕(武王) • 성왕(成王) • 강왕(康王) • 소왕(昭王) 둥 주 나라 초기의 임금 칭호가 보이니, 늦은 것도 서주시대를 넘어가지 논 않을 듯하다.
56) 『恨堂菜林』 卷二 周大武樂효考 및 說성葬요舜.
그러나 『모전』 등 옛날 주해(注解)를 보면 호천유성명(昊天有成命) 에 보이는 〈성왕(JP.王)〉을 〈무왕(武王)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고 ,5 7) 재현(敬見)과 방락(訪落)시의 〈소고(昭考)〉도 많은 학자들 이 〈무왕(武王)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하면서, 이것들을 성왕 때의 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옹(뽑)시의 〈문모(文母)〉가 〈문왕의 후비(后 妃) 태사(大姬)를 가리키는 말〉임과 대비시켜 볼 때 〈소고〉의 〈소〉 는 소왕(昭王)을 가리 키 는 말일 가능성 이 많다. 58) 옛 날 학자둘은 〈주 송〉을 모두 주나라 초기의 시로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이 다. 그런데 왕국유(王國組 1877~1927 〉 는 휼대 발(造敦 跋)이란 굳 .5” 에서 주나라 초기에는 시법(盆法)이 없었으니, 문(文)· 무(武) • 성 (JP.) • 강(原) • 소(昭) • 목(穆) 등 주나라 초기 의 임 금의 칭호는 모두가 호(號)이지 시(盆)가 아니라 하였고, 근래 곽말약(郭 洙若)은 『시 범 의 기 원 (盆法之起源)』 60) 에 서 시 법 의 기 원은 춘추시 대 중엽 이후의 일이라 하였다. 그러니 이 임금의 칭호를 후세의 시호 (盆號)와 같이 생각하고 그 작품의 시대를 얘기해서도 안될 일이다. 〈주송〉의 시들은 모두 분장(分章)이 되어 있지 않고, 편장 자체에
57) 朱熹 『詩菜傳』에선 「成王, 名踊 武王之子也.」라 설명하고 있다.
58) 馮玩君 • 陸何如 共著 『中國詩史』 卷一 古代詩史 篇二詩經 참조.
59) 『觀堂集林』 卷 18.
60) 『金文最考』·
도 혼란이 있는 듯하다. 앞의 주(注)에 인용한 『 좌전 (左傳)』 선공 (宜公) 12 년의 초자 0 老子 )의 말만 보더 라도 무(武)와 뢰 (첫f) • 환(桓) 이 같은 한 편의 작품인듯 한데, 지금은 따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 고 주회가 1i'시집전』에서 지적한 것처럼 61) 지금 보면 협운(協韻)하지 않 은 듯한 작품도 많은데, 이것은 시대가 빠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 각된다. 그리고 Ii'시경』 중 내용을 알기 어려운 작품이 가장 많고, 문장의 표현도 매끄럽지 못하고 까다로운 게 많다. 모두가 문장의 시대가 오래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조상을 제사지내는 작품과 공덕을 송양(碩 揚)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성덕을 칭송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전실성이 결여된 게 홍이라 할 것 이다.
61) 卷 19 淸廟 注 ; 「周碩多不吐韻, 未詳其說. 」
〈노송(魯碩)〉은 4 편 모두가 노나라 회 공(僖公, B.C .659~B.C.627 在 位) 때 의 작품이 다. 위 원 ( 魏源 , 1794~1856) 은 Ii'시 고미 (詩古微)』 62) 에 서 이것들은 〈상송(商碩)〉과 함께 노나라 회공 4 년 (B.C . 656) 에 회공 이 송(宋)나라 환공(桓公, 襄公 의 아버지)과 함께 제 ( 齊 ) 환공(桓公)을 좇 아 초 (楚) 나라를 정벌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각각 지은 것이라 하였다. 이 때 남만( 南藍)으 1 초나라가 매우 강성해졌는데, 제나라 환공이 중원(中原)의 제후( 諸侯 )들과 힘을 합쳐 이들의 예봉(銀錄)을 꺾었으므로, 이것은 중원의 제후들이 초나타를 밀어낸 쾌거(快擧)라 생각되어, 노나라와 송나타의 임금들은 자기 나타로 돌아와 각각 조상에게 이 무공(武功)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시와 무공을 과장 하는노래를 짓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왕백(王柏, 1197~1274) 이 Ii'시 의 ( 詩疑 재 권 1 에 서 「〈노송〉 牛민 중에 는 〈풍〉체 (體)도 있고 소 아체 • 대 아채 의 글도 있으니 〈송〉의 번체 遷困體)이 다. 」고 주장하고 63) 있듯이 , 이들 중에는 시의 내용은 물론 문장기교까지도 약간 차이 가 나는 작품들이 있으니 , 회공 이후에 지어전 작품이 있을 가능성 도 있다.
62) 卷 6, 魯碩韓詩發微
63) 실재로 閉 • 有翻시는 風體에 가깝고, 浮水 • 閑宮은 二雅에 가까우며 商傾의 長 發 • 殷武문 본따서 지은 것인듯 하다 .
〈상송〉은 옛날에는 Ii'시경』 중 가장 오래된 상(商)나라 때의 노래
라 주장하는 이도 있었고 ,b4) 송(宋)나라 때의 노래이되 정고보(正考 父 )65) 이전의 작품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66) 그러나 위원(魏源)은 『시 고미 (詩古微 M 에 서 67) 〈상송〉이 송나라 시 라는 증거 를 열세 가지 둘고 있고, 왕국유(王國維)와 부사년(傅斯年 )68) 등이 다시 그 증거를 보충하였다. 다만 왕국유는 이룰 송나라 대공(戴公) 때 (B.C .799~B.C. 766 在位)의 작품이라 본 데 비하여, 위원과 부사년온 양공(襄公) 때 (B.C.650~B.C.637 在位)의 작품이 라 하였는데 , 뒤 의 설이 사실에 가 까운 듯하다.
64) 『毛傳』 등.
65) 宋 나타 戴公 • 武公 • 宣公윤 성 7J (B . C. 7 9 9~B. C. 7 27) 宋나라의 大夫. 孔子의 七 代祖.
66) 『國語』 魯語, 『史記』 宋世家, 다만 『史記』에선 襄公 (B . C. 650~B. C. 637 在位) 때 의 正考父라 하여 混亂울 일으키고 있다.
67) 卷 6, 商碩 • 魯韓發微.
68) 王國維 『觀堂菓林』 卷 2 說商頭下. 傅斯年 ; 周碩說 및 魯碩商碩述(『個孟眞先生 菜』) 참조.
어떻든 〈노송〉과 〈상송〉의 시들은 살아 있는 임금인 노나라 회공 과 송나라 양공의 공덕을 칭송하고, 한편 그 공덕을 옛날 선조들에 게 고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시들이니 더욱 진실성이 결 여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경』에는 〈국풍〉이 160 편, 〈소아〉 7 伐 , 〈대 아〉 31 편 , 〈송〉 40 편 (그 중 〈주송〉 31 편 , 〈노송〉 牛던 , 상 송〉 5 편)이 실려 있는데, 이 편수의 수자 차이는 거의 그 내용의 문학적 인 성취 와도 부합하는 듯하다.
4. 『시경』의 문학적 성격 중국의 전통문학은 시를 중십으로 발달해 왔고, 다시 그 시는 서 정시(行情詩)가 중십을 이루며, 또 그 서정시는 남녀간의 사랑과 관 계되는 것들이 주유(主流)를 이운다. 따라서 중국의 전동문학은 사 랑의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늘 문학을 사회교화의 수단으로 내세워 온 중국인들의 문학론과는 모순되는 현상이다. 이 모순 현상을 빚는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시경』이니, 『시경』의 중십을 이루는 〈국풍〉의 시들이 아미 대부분이 서정시이 고, 또 거기에는 남녀의 사랑 문제와 관련된 시들이 과반수를 차지 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 인용한 것처럼 『시경』의 첫머리에 놓인 관처(關唯)시가 젊은 남자가 이성을 그리는 노래이다. 이런 시들에 대하여 학자들 이 아무리 윤리적인 설교로써 풀이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가슴에 는 옛 사람들의 진실한 정 이 먼처 와 닿는다. 보기 로 용풍(j郁風)의 상중(桑中) 시 몰 읽 어 보자. 새삼을캐러 매 69) 고울로 갔었네. 누가 보고파서 갔나?
69) 매 (洙)는 뒤 의 상중(桑中) • 상궁U:.宮)과 합께 모두 위 (衛)나라에 있 던 크고 작 은 지명(地名).
어여본 강씨 70) 네 맏만이지. 상중에서 나와 만나 상궁으로 나와 갔다가 기 수(洪水)가까지 바래 다 주데 나. 보리를베러 매 고을 북쪽에 갔었네. 누가 보고파서 갔나? 어여쁜 익씨네 맏딸이지. 상중에서 나와 만나 상궁으로 나와 갔다가 기수가까지 바래다 주데나. 순무를 뽑으러 매 고울 동쪽에 갔었네. 누가 보고파서 갔나? 어여쁜 용씨네 맏딸이지. 상중에서 나와 만나 상궁으로 나와 갔다가 기수가까지 바래다 주데나. 愛采唐矣, 洙之鄕矣. 云誰之思? 美孟姜矣. 期我平桑中, 要我平上宮, 送我平洪之上矣. 옻采麥矣, 洙之北矣. 云誰之思? 美孟七矣. 期我平桑中, 要我平上宮, 送我平洪之上矣. 袋采蔚矣, 洙之東矣. 云誰之思? 美孟庸矣. 期我平桑中, 要我平上宮, 送我平洪之上矣.
70) 강(姜)씨는 뒤의 익(卞)씨 • 용에f)씨와 함께 이 시대 대족(大族)의 성(姓)입.
이는 사랑하는 남녀의 밀회를 노래한 것임에 들림없다. Ii'모전』에
서는 「음분(浮拜)함을 풍자한 것J이라 설명하였지만, 독자들은 누구 나 젊은 남녀의 밀회를 가슴에 느끼며 미소지을 것이다• 〈소아〉에 도 습상(限桑) 시 같은 사랑의 노태 가 있다. 진펄의 뽕나무 아름답고 그 잎새 무성하네. 우리 님 만났으니 즐거웅 어떠하겠는가? 진펄의 뽕나무 아름답고 그 잎새 야드르하네. 우리 님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 ? 진펄의 뽕나무 아름답고 그 잎새 더부록하네. 우리 님 만났으니 언약 굳고 굳게 하네. 마음으로 사랑하거늘 어짜 고하지 않으리 ? 마음 속에 품고 있거늘 어느 날인듐 잊으리 ? 隱桑有阿, 其葉有難. 槪見君子, 其樂如何? 限桑有阿,其葉有沃.
匠見君子, 云何不樂? 限桑有阿,其葉有幽. 槪見君子,德音孔歷. 心平愛矣, 追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Ii'모전』에서는 「유왕(幽王)을 풍자한 것이다. 소인이 벼술자리에있고 군자는 야(野)에 있어, 군자를 만나 마음을 다하여 섭기게 될 것을 생각한 것이다.」 71) 고 엉뚱하게 둘러대고 있다. 『시경』에서논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애인도 〈군자〉라 부르고 있으니, 이 시는 사 랑의 기쁨을 노래한 게 분명하다.
71) 「刺幽王也. 小人在位, 君子在野, 思見君子, 盡心以事之 . 」
그러나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사랑은 원칙적으로 부부애 (夫婦愛)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Ii'시경』에서보다도 한(漢) 대 이후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중국문학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랑이란 봉건윤리(封建倫理)에서 허용되는 기생이나 첩 또는 후궁 (後宮) 같은 여 인들과의 관계 분이 다. 『시 경 』에 도 부부애 를 바탕으 로 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보기로 제풍@釋 l) 의 계명(鷄鳴) 시를 돈다. 「닭이 울었으니 조정엔 대신들 다 모였겠어요.」 「닭 울음 소리가 아니라 쉬파리 소리 아니었소?」 「동녘이 밝았으니 조정엔 대신들 많이 모였겠어요.」 「동녁이 밝은 게 아니라 달빛 바치는 것일 게요.」 「벌레등 깨어나 붕붕 날아도 달콤히 당신과 함께 꿈꾸고 싶지만, 대신들 모였다 들아갈 테니 당신 미음사는 일 없어야지요.」 鷄紙鳴矣, 朝匠盆矣. 匠鷄則鳴, 蒼繩之聲. 東方明矣, 朝競昌矣. 匠東方則明, 月 出之光.
蟲飛礎腐 甘與子同夢. 會旦槪矣, 無庶予子槿. 새벽 참자리 속에서의 부부의 대화로 이루어전 시이다. 난편은 적 어 도 대 부(大夫)이 거 나 제후의 신분안듯 하다. 사랑에는 즐거움분만이 아니라 갈등도 따르게 마련이어서 『시경』 에는 자기를 버란 남편아나 떠나간 님을 그리는 시도 많다. 특히 나라의 역사(役事)나 수자리에 젊은이가 칭발당해 가던 행역(行役) 온 더욱 처철한 갈등의 원인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님 그리는 시들은 혼히 이 〈행역〉과 관련지어 시의 뜻을 풀이하였다 (例 : 朱熹 『詩集傳』). 보기 로 소남(召南)의 은기 뢰 (殷其寧)를 든다. 우르몽천둥 소리 남산 기슭에서 울리는데, 어쩌다 님은 이곳 떠나 돌아웅 툼조차 못 내는가? 늠름한 우리 님이여 ! 돌아오시이다, 돌아오시이다! 우르롱 천둥 소리 남산 곁에서 울리는데, 어쩌다 님은 이곳 떠나 쉬러 올 듬조차 뭇 내는가? 늠름한 우리 님이여 ! 돌아오시이다, 돌아오시이다! 우르몽천둥소리 남산 밑에서 울리는데, 어쩌다 님은 이곳 떠나 집에 운 듬조차 뭇 내는가? 늠름한 우리 님이여 ! 돌아오시이다, 돌아오시이다! 殷其露, 在南山之陽. 何斯違斯, 莫政或遠?
振振君子, 歸哉歸 哉! 殷其 靈 , 在南山之側. 何斯述斯, 莫 政 迫 息? 振 振君子, 歸哉歸哉! 殷其 臨 , 在南山之下. 何斯 違 斯, 莫或 追 處? 振振君子, 歸哉歸哉! 사랑의 준거움을 노래한 시나 사랑의 갈등을 노래한 시나 모두가 아름다움과 공명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다. 이 밖에 어떤 사람을 찬미한 시나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정감을 노래한 시들이 있는데, 특히 〈국풍〉의 시들은 전실한 감정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느끼게 한다. 후세의 중국인들은 이런 작품들을 그들 문학 의 전범(典範)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학론을내세우면서 도 실제로는 멋지고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전개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옛사람들이 시의 목적을 사회 교화에 결부시켰던 것은 『시경』을 놓고 보더라도 근거없는 일이 아니었다. 『시경』 속 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괴로움과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이 른바 〈 사회시 (社 會 詩)〉도 적지 않은 분량이 들어 있다. 먼처 위풍( 魏 風 )의 벌단(伐檀) 시를 보기로 돈다. 광광 박달나무 베어다가 황하가에 놓고 보니 황하물 맑게 물놀아치고 있네. 씨부리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째서 수만석의 벼 거뒤들이고, 침승 사냥도 않는데 어째서 저 집 뜰엔 걸려 있는 담비가 보이는가? 진실한 군자란 늘고 먹지 않는 법이라던데.
광광 바퀴 살 감 배어다가 황하 겉에 놓고보니 황하물 맑고 평평히 흐르고 있네. 씨뿌리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째서 수여 다발 벼 거뒤들이고, 짐승 사냥도 않는데 어째서 처 집 뚤엔 걷려 있는 큰 짐승이 보이는가? 전실한 군자란 놀고 먹지 않는 법이라던데. 광광 수레 바퀴 7J- 베 어다가 황하가에 놓고 보니 황하물 맑게 찬물결 짓고 있네. 씨뿌리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째서 수백 창고에 벼 거뒤들이고, 침승 사냥도 않는데 어째서 저 집 뜰엔 걸려 있는 메추리가 보이는가? 진실한 군자란 놀고 먹지 않는 법이라던데. 埃埃伐檀分, 腐之河之干分, 河水淸旦 Ml~. 不核不稿, 胡取禾三百區分, 不狩不狼, 胡瞬爾庭有縣桓分? 彼君子分, 不素裝分. 埃埃伐幅分, 宜之河之側分, 河水淸旦直狩. 不隊不稿, 胡取禾三百億分, 不狩不狼, 胡際爾庭有縣特分? 彼君子分, 不素食分. 吹埃伐輪分, 宜之河之游分, 河水淸旦論狗. 不核不稿, 胡取禾三百困分,
不狩不狼, 胡 昭爾庭有縣 ~u 分 ? 彼君子分, 不 素 娘分. 위풍의 시들은 전부가 사회시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가난 한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굶기 일쑤인데, 지배계 층 의 사 람들 중에 는 매일 놀기만 하는데도 그의 집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곡석을 거뒤둘이고 다 잡아먹을 수 없을 정도의 침승들이 모여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와 어지 러운 정치를 원망하는 작품들이 여러 편 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불행을 안겨 주던 것은 전쟁이었던 것 같다. Ii'시경』에는 전쟁과 관련된 시들이 여러 편 있다. 패풍(~IJS 風 ) 의 격고澤鼓) 시를 보기로 돈다. 복소리 둥둥 울리며 무기 들고 뛰어나섰네. 도읍과 조( f曹 )땅엔 성 쌓 기 한창인데, 나 홀로 남쪽으로 싸우러 가네 . 손자중 장군 따라 전(陳)나라와 송(宋 ) 나라 강화 맺게 했는데, 나를 돌려 보내 주지 않으니 마음의 시름 쌓이네. 이곳에 찼다 저곳에 머물렀다 말조차 잃어버리고 말을찾으러 숲 속을 헤매네. 죽음과 삶, 만남과 해어침을 그대와 함께 하기로 언약했었지. 그대 손잡고 그대와 해로하려 했었건만 ! 아아 멀리 떠나와 우리 합께 못살게 되다니 !
아아 멀리 떨어져 우리 언약 어기게 되다니 ! 擊鼓其鐵 踊躍用兵. 土國城浦, 我獨南行. 從孫子仲, 平陳與宋. 不我以歸, 끗心有仲. 옻居姜處, 愛喪其馬. 于以求之, 于林之下. 死生契腦, 與子成說. 執子之手, 與子借老. 于뻗關分, 不我活分. 于鹿商分, 不我信分. 〈소아〉에 도 채 마 (采薇) • 출거 (出車) • 하초불황(何草不黃) 등의 시 가 있는데, 모두 백성들의 비전적(非戰的)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이러 한 사회시둘이야말로 시의 풍자적인 기능 또는 사회 교화의 공용성 (功用性)을 중시 하는 중국의 시 몬에 완전히 부합하는 성 질의 것 이 다. 끝으로 〈아(雅)〉와 〈송(碩)〉 속에 들어 있는 연회 (冥會)나 제 사여은 祀) 등에 쓰던 노래 들은 옛 날 제 정 일치 (祭政一致)의 제 도와 춘추시 대 이전의 시의 실용성(貸用性)이 강조되던 사회 풍습의 유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시들은 문학적인 가치는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고 대사회사(古代社會史)의 자료로서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라 하겠다. 〈주송(周碩)〉의 유청 (維淸) 시 를 보기 로 든다. 맑게 꿇이지 않고 밝게 이어오니 문왕의 법도일제. 제사지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정사 이룩하여 놓았으니 주나라의 상서 로웅일세.
維淸組熙,文王之典. 肇煙, 造用有成,維周之禎. 시는 간단하지만 이런 노태돌에는 충도 겹들여졌을 것이다. 『시경』 의 시들은 크게 볼 때 이상과 감이 〈서정시〉 • 〈사회시〉 • 〈전례시 (典盜詩)〉의 제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정시〉는 중국 정통문학의 중심을 이루는 성격의 것으로 발전하고, 〈사회시〉 논 공용적인 문학론의 근거가 되며, 〈전례시〉는 고대의 시의 실용 적인 성격울 대변해 주는 것이다.

5. 곁 론 『시 경 』은 중국문학의 조종(祖宗)이 라 할 만큼 후세 문학 발전의 바 탕이 되었다. 그리고 춘추시대에 공자가 만인의 교과서로서 〈육경 ( 六蓋)〉 의 하나로 『시 경 』을 편찬하여 , 『시 경 』은 시 가집 이 면서 도 〈경 (經)〉으로서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였다. 득히 한(漢)대에 와서 모든 경서들의 판본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와 주석(注釋)이 가해지면서, 『시경』은 민가를 모아 놓은 〈국풍〉조차도 모두 〈풍자 (風節〉의 뜻을 지닌 사회교화의 의의가 있는 기록으로 여지 해석되 었었다. 그러나 『시경』 속에는 이미 아무리 둘러대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갖가지 아름다운 서정(行情)이 상당히 세련된 아름다운문장 속에 담겨 있다. 그 때문에 학자들이 아무리 시는 사회교화의 효용 을 동하여 가치를 지니게 괴는 것이라 설교를 하여도, 『시경』에 이 미 담겨 있는 아름다운 서정과 수사(修辭)는 문학자들로 하여금 부 지불식간에 순수문학적인 가치를 인식케 하였다. 그래서 중국문학 은 그들의 문학론과는 달리 오히려 〈서정〉과 〈수사〉를 중십으로 발 전하게 되는 것이다. 『시경料 시들은 사언(四言)이 기본 형식을 아루고 있지마는삼언 (三言) • 오언(五言) 등 잡언(雜言)들도 상당히 섞여 있다. 그것은 앞 철(節)에서 보기로든 상중(桑中) • 계명~~~) • 은기뢰(殷其磁) • 벌단 (伐檀) 같은 시들만 보아도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정언
(薔 言 )을 거부하는 일상 용 어로 이 루 어진 인 요 에 서 나온 시들이기 대 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벌단(伐植)과 격고(昭鼓) 같은 시에 보이는 남방가요에 흔히 쓰이는 〈分〉 라는 조사를 보면, 주남(周南)과 소남(召 南) 의 〈남〉 이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임과 아 울러 생각할 때, 『시경』에는 이미 남방문화의 영향이 질게 물들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한편 『시경』이 지리적으로는 황하 유역으로부터 장강 ( 長 江) 유역에 이르는 영역(지금의 河北 • 山西 • 河南 • 山 束 • 陝西 • 江 蘇 · 安徽 • 湖北 등울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표함을 뜻하며, 시대적으로 논 장강 유역이 중국문화의 판도 안으로 들어온 서주 말엽 이후의 시가들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지역은 『시경』에 영향을 끼찬 곳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실제로 『시경』이 노래불리워진 지 역 은 주(周)나라 왕조(王朝)이 며 , 문장도 주나라 왕조에 서 쓰논 문 자와 문장으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춘추시대에는 노(魯)나라에 전하여쳐 주악(周樂)이라 불리워졌었지만, 공자가 이 를 정리할 적에는 다시 노나라를 중십으로 한 그 시대 문장의식에 의하여 교정이 가해전 것일 것이다. 그리고 『시경』 속에 서주시대 의 작품들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서주시대에는 이 시가들이 순수 한 가요(歌喆)의 형태이거나 천자의 정치를 위한 참고 기록의 형태 로서 촌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서주시대의 문학이라 보기는 어 렵 다. 『시 경 』온 공자가 만년 (6 터 이 후, B.C.484~B.C.479) 에 이 를 〈육 경(六經)〉의 하나로 정리 편찬한 이후에 비로소 책으로서의 성격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춘추시대의 문학의식을가장뚜렷이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 이전에도 이 시가를 기록하는 사 람들이 그들의 문장의식에 의하여 문귀를 많이 수정하였을 것이고, 공자 이후에도 적지 않은 변모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나, 대체적인 『시경』의 성격은 꽁자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漢)대에 이루어전 『모전(毛傳)』 • 『삼가시(三 家詩) 』 등의 해설과 정 현(鄭玄) 같은 학자들의 주석 (注 釋 )은 중국문학사에 있어 또 시의 원작자나 그 편찬자인 공자보다도 더 뚜렷이 『시경』의 지 위를 확정지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경』의 판본
이 한대 학자들의 손에 이 루 어진 것이고, 또 그들의 주석을 바탕으 로 『시경』이 읽혀지고 연구되어 왔다는 정은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참고도서〉 『詩經諺解』 18 卷, 朝鮮 宜祖 命撰. 『詩經集傳辨正』 6 冊, 朝鮮 沈大允 撰. 『詩經講義』 『補造』(『丁茶山全策』 經樂) 二集 卷 17~20, 朝鮮 丁若鏞 撰. 『詩經孔學考』 7 卷, 朝鮮 李炳憲 撰. 『詩經(社譯)』 韓國 金學主, 明文堂, 1971 . 『詩經(國風選)』 韓國 金學主,探求堂, 1981 . 『毛詩硏究』 韓國 金時俊, 瑞麟文化社, 1981. 『毛詩正義』 40 卷, 毛氏傳, 鄭玄 築, 孔頭達 疏(『十三經注疏』 本). 『詩集傳』 8 卷, 宋 朱憲: 撰. 『呂氏家塾讀詩記』 32 卷, 宋 呂祖謙 撰. 『詩輯』 36 卷, 宋 嚴梁 撰. 『詩經世本古義』 28 卷, 明 何階 撰. 『毛詩稽古編』 30 卷, 淸 陳啓源 撰. 『毛詩後堂』 30 卷, 淸 胡承棋 撰. 『毛詩傳疏』 30 卷, 淸陳矣 撰. 『毛詩傳接通釋』 32 卷, 淸 馬瑞辰 撰. 따古微』 17 卷, 淸 魏源 撰. 『詩三家義集疏』 上下, 淸 王先謙 撰. 『詩經釋義』 上下, 民國 屈萬里 撰. The Book of Song s , Arth ur Waley, 2nd Ed. 1952, Allen and Unwi n, London. The Book of Odes, Bernhard Karlgr e n, 1950, Sto ckholm. The $hi kin g ( Tbe Chin e se Classic s Vol. 4), Jam es Legg e , Oxfo r d Univ e rsit y Press, 1871, London. The Bell and the Drum, C.H . Wang , Univ e rsit y of Califo rn ia Press, 1974.
 二· 『書經』
二· 『書經』
L 『서경』의 성격과 처작 시기 『서경』은 중국 〈산문지조(散文之祖)〉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의 가 장 오래된 전적의 하나로 중국 산문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Ii'시 겅』이 중국의 시와 전동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실과 아울 러 생각할 때, 중국문학사상 『서경』은 『시경』과 함께 중국문학의 이대원천(二大源泉)이라 할 ~ 것이다. Ii'서경』은 본시 〈서〉라고만 불리웠는데, 그것은 Ii'시경』이 〈시〉라 고만 불리웠던 사정과 같다. 본시 〈書〉자는굴이나 책의 범칭(況稱) 이 아니 라 공문(公文)의 뜻을 지 녔던 듯하다. Ii'시 경 』 소아(小雅) 출 거 (出車)시에 「長此簡 書 」(이 공문서를 경외한다)란 귀절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簡 書 〉가 〈죽간(竹簡)에 씌어전 공문서〉의 뜻이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서경』의 굳이 대부분 조정의 공적인 기록임을 생각할 때, 본시는 〈 書 〉가공문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동한여〔 漢)의 허 선(許愼)은 『설문해 자(說文解字)』 서 연:)에 서 「대 쪽이 나 비 단 에 쓰인 것을 書 라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書〉의 뜻이 넓 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시 〈 書 〉자는 〈著〉로 썼었는데,1) 뒤에 쓰는 기구를 뜻하는 〈韋〉과 말한다는 뜻의 〈曰〉자를 합쳐 〈말 울 기록한 것〉이란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변하였다 한다 .2) 그러니 Ii'서경』도 〈말한 것울 기록한 것〉이란 뜻까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l) 『說文解字』 ; 「秦, 著也 ; A 韋 者聲. 」 2) 『漢함』 藝文志에 「左史記言, 右史記事 ; 事爲春秋, 言爲尙霞. 」라 한 것도 이 글자 의 모양이 影響을 준 듯하다.
많다. 또 『서 경 』은 혼히 『상서 (尙 8) 』 라고도 불리 운다. 『 상서 』 란 호칭 은 한(溪) 문제 (文帝, B.C.179~B.C.157 在位)대의 복생 (伏生)에 의 하여 〈상 고(上古) 시대의 굳〉이란 뜻에서 붙여진 말이라한다 .3) 복생 이후로 사마천(司馬逸 B.C.145~B.C.86? )의 『 사기 (史記)』, 동중서 (造仲 8 子 , B.C.179~B.C.93? )의 『춘추번로( 春秋繁露 )』 등에서 『상서』란 말을 사 용하여 일반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묵자(晟子)』 명귀(明鬼)편에 〈상서(尙 건 )〉란 말이 보이나, 그것은 〈 하서(夏 書)〉 를 형용한 〈상고시 대의 굳〉이란 뜻의 말이다 .4) 그리고 〈尙〉자의 뜻에 대하여는 「상천 (上天)의 뜻으로, 『 상서 』는 〈 천서 (天書)〉의 뜻이 다. 」 5) 또는 「상(上)과 뜻이 동하여 임금을 가리키며, 『상서』란 임금의 행위를 산하가 기록 한 것을 뜻한다.」 6) 는 둥의 해설을 한 이들도 있으나, 〈상(上)자와 동하여 상고(上古)의 뜻〉으로 봄이 무난할 것 이 다.
3 )1i'僞孔傳』 序· 그리고 伏生은 그의 해선율 분인 간名을 『尙얀大傳』이라 하였다.
4) 『星子』 OO 鬼下 : 「故尙합夏한, 其次商周之한, 語數鬼神之有也. J
5) 鄕玄 Ii' 합賢 』(見『尙 완 正義』).
6) 王充 『 論衡 』 須碩편, 王肅의 『한JH:(見『尙합正義』).
지 금 우리 에 게 전해 지 는 『서 경 』은 『십 삼경 주소(十三經注疏)』 속에 들어 있는 『상서정의(尙書正義)』인데, 그. 본문인 이른바 『고문상서 (古文尙 참 )』는 후세 사람이 가짜로지어낸 위서(僞 書 )이며, 거기에 붙 어 있는 이른바 한( 漢 ) 초 공안국(孔安國)이 지었다는 『공전(孔傳)』도 전부가 위작(僞作)이다. 그러나 이 가짜 『서경』은 진짜인 한( 漢) 초 에 복생 (伏生)이 전했 다는 이 른바 『금문상서 (今文尙 書 )』 29 편을 근 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가짜 속에 진짜가 섞여 전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서경』은 모두가 58 편인데, 그것은 복생 의 29 편을 33 편으로 늘인 다음 다시 25 편의 가짜를 만들어 덧 붙여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아 같지는 않으 나 왕선경 (王先計 rt , 1842~1917) 의 『상서 공전참정 (尙 書 孔傳參正)』 서 례 어갱 l) 에서는 지금의 『서경』 중 진짜 29 편을 다음과 같이 가려내고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하다. 1) 요전(堯典 지금의 舜典의 「愼徽五典」 이하 포함), 2) 고요모.( 阜 陶謨,
지금의 益稷편도 여기에 포함), 3) 우공(氏貢), 4) 강서(甘fl), 5) 탕서 (潟 普 ), 6) 반경(盤庚), 7) 고종웅일(高宗形日), 8) 서백감려(西伯戱 黎), 9) 미자(微子), 10) 목서 (屈哲, 또는 4 炤정), 11) 홍범 (鴻範, 또 는 洪範), 12) 대 고(大話), 13) 금동(金脈), 14) 강고여璋~). 15) 주 고(酒浩), 16) 자재 (粹材), 17) 소고(召話), 18) 낙고(雜話 또는 洛話), 19) 다사(多士), 20) 무일(無低 또는 無逸), 21) 군석 (君奭), 22) 다 방(多方), 23) 입 정 (立政). 24) 고명 (顧命), 25) 강왕지 고예臼王之話), 26) 비서 (柴판, 또는 費쨩), 27) 보형 (甫刑, 呂刑이라고도 함), 28) 문 후지 명 (文侯之命), 29) 전서 (秦팠. ). 7)
7) 그러 나 뒤 에 歐腸 • 大小夏侯에 이 르러 康王之皓가 顧命에 합쳐 져 28 篇이 되 었 다.
이 『서 경 』에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의 구별이 있는 것은, Ii'서 겅』 분만이 아니라 한(漢) 대의 경학(經學) 전반에 걸쳐 생겨난 현 상이었다. 본시 〈금문〉온 한나라 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예서(隸古) 로 씌어전 경서( 經밤 )를 뜻하고, 〈고문〉이란 그 이전에 쓰이던 옛자 체 (字體)로 씌 어 진 경 서 를 뜻하는 말이 었다. 따라서 〈금문〉이 란 한대 에 들어와 학자들이 새로이 정리한 경서였고, 〈고문〉이란 전시황 (秦始 皇 )의 분서 갱 유(禁 書 抗儒 )8) 로 말미 암아 민간이 나 옛 집 속에 숨 겨져 있다가 한나라로 들어온 이후에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경서였다. 이 〈금문〉과 〈고문〉은 경서에 따라 그 문장이나 내용에 많은 차이 가 있는 것도 생겨나고, 또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학자 사이에 학문 경향이 달라쳐 마침내는 〈금문파〉와 〈고문과〉로 나뉘어져 분쟁까지 생겼었다. 따라서 모든 유가(儒家)의 경전에 〈금 문〉과 〈고문〉의 구벌이 있으나, 그 중에도 그 차이가 가장 십하고 문제도 가장 많았던 게 『서경』이다. 그러면 『서경』에는 어떻게 하여 i' 금문상서料 『고문상서』가 있게 되었는가?
8) 秦始皇 34 年 (B . C . 213) 丞相 李斯의 奏 言 에 따라 貫用的인 책을 재의한 古代 典籍 운 다 태워 없애고, 다음 해에 460(!余 名의 住者들을 咸賜에서 산 채로 땅에 묻어 버 렀 던 감사件임 (『史記』 秦始皇本紀 참조).
공자가 편찬했다는 『서 경』은 진시황(秦始皇, B.C.246~B.C.210 재위) 의 분서갱유라는 난폭한 조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취조차 사라 지 다시 피 되 었 다. 한나라에 들어 와 문제 (文帝, B.C .179~B.C.157 재 위)
가 『서경』을 세상에 널리 구하였는데, 그 때 진나라의 박사였던 복 생(伏生)이 『서경』에 정통하고 있다는 말이 둘리었다. 문제는 곧그 를 불렀으나 그는 이미 나이 구십으로 기동(起動)이 부자유스럽다 하여 , 이 에 대 상시 장고(太常使 掌故) 조착(昴$읍 )을 보내 어 『서 경 』을 배워 오게 하였다. 이 때 조착이 복생에게 가서 베껴 온 『서경』이 『금문상서』 29 편이다. 전시황이 책을 태워버릴 때 복생은 자기 집 벽 속에 『서경』을 감추어 두었는데, 한나라로 들어와 찾아보니 나 머지는 다 없어지고 29 편만이 남아 있었다고도 한다 .9)
9) 『史記』 • 『漢 깐 』 儒林傳 참조.
『고문상서』는 본시 한나라 경제( 景帝 , B.C .156~B.C.141 재위) 때 10) 노(魯) 공왕(恭王)이 공자가 살던 집을 헐다가 벅 사이에서 『 예기 (綾記)』 • 『논어 (論語)』 • 『효경 (孝經)』 등과 함께 발견한 것 이 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옛 굳자인 〈고문〉으로 씌어 있었고, 『금문상서』와 견 주어 보니 16 편이 더 많았다 한다. 11) 그런데 이 것 을 공안국(孔安國) 이 구하여 연구하는 한편 조정에 바쳤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고 문상서』는 양한(兩 漢) 을 통하여 학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대문 에 위전(魏晋) 대에 들어가 영가지란(永嘉之亂, 311) 때에 완전히 없 어져 버렸다 한다. 이 밖에도 하간현왕(河間獻王)에게 『고문상서』가 있 었 다는 기 록도 있고 12) 동한(東漢)때 두림 (杜林)도 『고문상서 』를 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13)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 『漢한』 藝文志에는 武帝末이타 하였으나 잘못입.
11) 『漠합』 藝文志, 劉欲 『移太常博士완』등 참고.
12) 『漢密』 係十三王傳
13) 『後漢촙』 儒林傳.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서경』은 동진(東晋) 때 매색(梅殿)이 구하 여 바쳤다는 것으로 『금문상서』 29 편을 33 편으로 늘린 위에 다시 25 편을 더 위조하여 붙인 것이었다. 이 25 편에 대하여는 송(宋)대 의 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학자들의 의십을 받아오다가 청(淸) 대 에 이 르러 영 약거 (閣若戱 1636~1704) 의 『고문상서 소중(古文尙 書疏 證)』' 혜 동(惠棟, 1697~1758) 의 『고문상서 고(古文尙 書考 )』 등이 나옴 으로써 거기에 붙어 있는 『공전(孔傳)』과 함께 완전히 위작(僞作)임 이 증명되었다. 어떻돈 이 가짜 『고문상서』와 그것을 해설한 가짜
『공전』은 천여 년 동안 세 상 을 속여 왔고, 지 금까지 도 진짜라고 믿 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이니, 중국문화 전반에 걷쳐 끼친 그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문학사의 자료 또는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서경』을 다룹에 있어서는 이 가짜와 진짜를 엄격히 구분 해야만 할 것이다. 가짜 『고문상서 』는 이 밖에 도 한나라 성 제 며浦 r, B.C.32~B.C.7 재 위 ) 때에 장패(張覇)라는 사람이 102 편을 만든 일이 있었고 ,14) 한 말의 왕숙(王亂 195~256) 도 가짜 『 공전』을 만든 일이 있다 하나, 15) 이 것 둘은 모두 전하여지지 않았다. 한(漠)대부터 공자가 편찬한 『서 경』 은 본시 100 편이었다는 설이 유행하였고 ,16) 또 지금의 『서경』 속에 는 100 편의 〈서서( 밥 序)〉가 전하고 있어, 없어전 『서경』의 여러 편 을 되찾아 보고자하던 역대의 노력이 이런가짜까지도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4) 『漢密』 藝文志, 王充 「論衡」 正說펀 참조.
15) 丁煥 『尙맙除論』, 劉師培 『尙팝源流考.!I 등 참조.
16) 揚雄 『法言』 間神편, 王充 『論衡』 正說편, 『漢합』 藝文志 등.
2. 『서경』의 편찬과 그 내용 대체로 [j'서경』온 공자가 편정( 編 定)하여 유가의 경전으로 확정시 킨 것임에 룰림없다 .17) 그것은 그와 그의 제자들이 쓴 굳 속에 여 러 곳에서 『서감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믿는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서경』온 그 중 『금문상서』 29 편조차도 공 자가 편찬한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 그 문장이나 내용으로 보아 후 세 사람들이 고치고 더 보태고 한 것임에 들림없다.
17) 『史記』 孔子世家, 『漢 합 』 藝文志 동 참조.
『한서』 예문지(藝文志)에는 옛날부터 사관(史官)이 있었는데 「좌사 (左史)는 말을 기록하였고 우사(右史)는 일을 기록하였으며, 일의 기 록이 『춘추(春秋)』이고 말의 기록이 [j'서경』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옛부터 [j'서경』은 옛날 사관의 기록을 정리 편찬한 역사서이며, 내 용은 주로 옛 임금과 선하둘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서경』은 역사저인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겨 한 의미의 〈역사서〉는 아니며, 또 말뿐만이 아니라 일을 기록한 부 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서경』은 우서( 處書 ) • 하서( 夏 e ) • 상서(商 書 ) • 주서(周 합 )의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옛날에 논 이것들은 각각 그 시대의 사관들의 기록이며, 그것을 공자가 시 대 순으로 배열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문자와 문장의 성 격이나 서사( 書寫 ) 방법 등을생각하더라도주나라이전부터 이런 기 록과 문장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관의 기록이란 춘추시대
까지도 『춘추( 春秋 ) 』 에서 보여주는 것처럽 간결한 것이었을 것이다. 특 히 요전( 堯 典, 舜典 포함) • 고요모 (rr1 陶 誠 益稷 포함)에서 강조하 고 있 는 수신 ( 修身 ) • 제 가( 齊家 ) • 치 국(治國 ) • 평 천하(平天下)의 사상 온 공자 이후에 구체화된 학선이며, 탕서( 湯쩝 )에 강조하고 있는조 민벌죄 ( ,'ti~렀 伐 罪 )의 뜻 같은 것도 공자 이후의 사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18 ) 따라서 이것은 비록 상(商)나라 때부터 전해오던 사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손치더라도 내부분이 전국시대에 이루어전 굳들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 상서〉의 반경(盤庚) • 고종웅일(高宗形 13) • 서백감려(西伯裁 黎 ) • 미자( 微 子)편은· 문장의 성질로 보아 보다 오래된 글인듯 하나, 역시 모두 주나라로 들어와 송여근)나라 사람 둘이 상나라 문헌을 근거로 옛날 일을 다시 기록한 것일 것이다. 『서경 』 에도 송나라 문헌이라 생각되는 〈 상서〉의 분량이 특히 많은 것 은, 공자가 『시 경 』에 〈 노송( 魯 碩)〉과 〈 상송(商碩)〉을 〈주송價]碩)〉 과 나란히 배열하였던 뜻과 같을 것이다.
18) 余 永梁은 『柴 짬 的時代 考 』(『古史 辨 』(二))에서, 이것들의 題目이 典 • 謨 란 말을 쓰 고 있고, 「曰若租古」로 시작하고 있고, 임금윤 帝라 부르고 있으니(商周時에는 生 時엔 王, 死後에 야 帝타 불렀다. 操金文), 모두 常 時의 기 목이 아님 이 分明하다 하였다.
〈 주서 〉 중에서도 확실히 서주(西周)시대의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것 은 대 고(大 話) 로부터 고명 ( 顧 命, 康 王之 皓 포함)에 이 르는 12 편이 다. 19) 그리 고 이 12 편의 과반수가 주공(周公)과 관계 있는 작품인 것은 이것이 주공의 후손인 노(魯)나라에 보존되고 있던 공문서를 근거로 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주공의 공로를 미화한 내용의 금 둥( 金 脈) 편은 바로 노나라에서 저작된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 고 오행 (五行) • 오사(五 事 ) 등을 논한 홍범 ( 洪 範)편은 전국시 대 음양 가(陰 腸家 )의 영향임이 분명하다• 이 밖에도 공자 아후에 이루어진 성싶은 작품들이 있으나 다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할 분이다. 근인 여 영 량(余 永 梁)이 비 서 ( 費普 )를 노나라 회 공(僖公) 때 에 만들어 전 문 서 라 하고 있는데 , 전서 (秦 쨩 )도 그 무렵 (B.C.626) 의 작품이 다. 20) 그 밖의 다몬 편들도 모두 노나타의 문서가 중십을 이루고 있다고 보
19) 屈萬里 『尙 한釋義 』 奴 論 참조.
20) 余 永 梁 Ii'柴 哲 的時代考』(『古史 辨 』(二)).
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자가 편찬한 『 서경』온 대체로 〈 상서 〉 와 〈 주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었을 것임을뜻하는 것이다. 이 밖 에도 고대 성왕에 관한 전설과 사관의 기록은 여러 곳에 전하여 지 고 있어서,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근거로 후세 유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전 글들이 『서경』에 덧보태어졌던 것 같다. 그리고 『서경』온 전한( 秦漢 )대에도 큰 변동을 겪었고, 다시 그 후세에도적 지 않은 파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서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다 . 그러나 대체로 어느 시대의 누구의 말임을 밝 히면서 어떤 문제에 관한연설이나 신하에게 고하는 문장을담고 있 논 고( 話 ) • 명(命)을 중십으로 한 작품들이 서주 초에 이루어진 것 들이고, 연설이나 대화의 형식을 빌어 정치의 도리를 밝히거나 옛 날 임금의 사적을 미화하고 있는 논설문인 전(典) • 모( 謨 )를 중십으 로 한 작품들은 동주시대에 이루어진 작품이라 보면 될 것이다.
3. 『서 경』의 문장과 특칭 『서경』의 각 편들은 모두가 서로 앞 뒤의 연관이 없는 독립된 자 료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같은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하여 씌어전 것이 아니라 오렌 시대에 걷쳐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나 내용의 성격도 제각기 다르다. 따라 서 『서경』의 문장이나 내용의 득칭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 서는 지금 전하는 『서경』의 가짜 부분은 제의하고 진짜 28 편에 대 하여만 언급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우선 『서 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인듯 하다고 한 〈주서〉의 대고(大 話 ) 이하 고명 (顧命)에 이르는 12 편올 보면 거의 모두가 임금 (成王)이나 그 임금을 대신하는 입장의 사람(周公)이 신하나 백성들 에 게 훈사하는 내 용의 굳이 다. 아 중 소고(召 皓 )와 낙고(洛話) • 무일 (無逸) • 고명 (顧命)의 내 용은 물론 신하에 게 한 말은 아니 나, 21 ) 교 훈적인 성격은 비슷하다. 그리고 대고(大話)와 강고예稽 E) 는 주공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굳이고 ,22) 고명(顧命)을 제의한 나머지 9 편은 모두 직접 주공이 말한 것이거나 주공이 동장하는 굴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노(魯)나라에 전하여지던 문서이며, 공자가 편정한 『서경』 온 이것들울 중십으로 한 것이었으리라 추측한 것이다.
21) 召 浩 는 召公이 周公율 동하여 成王에게, 洛諾와 無逸온 周公이 成王에게, 顧命 온 成王이 康王에게 告하는 말이 다.
22) 모두 周公 束征과 관계되는 굳임.
이 12 편의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칭은 모두 대부분이 직접화법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앞머리에 그러한 훈시를 하게 된 연유와 훈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간결한 몇 귀절로 설명을 한 뒤 바로 그 훈시 를 인용하고 있다. 주고(酒皓)와 자재 (}辛才才) 같은 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王若曰」 또는 「王曰」하고 훈시를 시작하고 있다. 간혹 대화 형식도 보이나 이는 단순한 문답이 아니 라 훈시와 훈시 사이에 그 훈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는 성격의 다 론 사람의 말을 끼워 놓은 격이다. 이 직접화법은 어떤 뜻을 표현 하는 이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 같은 것도 아울러 전 달할 수 있고, 뜻의 전달을 좀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느끼게 한 다는 장접이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사람들의 일상용어와는 완연 히 다른, 꾸며지고 다듬어전 문장이다. 보기로 대고(大皓)의 한 대 목을돈다. 그래서 나는 소자(小子)로서 감히 하느님의 명을 어기지 못하겠소. 하 늘은 무왕(武王, 세상을 편케 하신 임금)을 훌륭하다고 여기시어 우리 작 온 나라 주(周)를 일으켜 주셨소. 무왕께 서 는 오칙 정 (占)을 따르시 어 이 명(天命)을 편안히 받으실 수가 있었소. 지금하늘은 백성을 돕고계시니, 어떻돈 또 집을 따르려는 것이오. 아아 ! 하늘이 위업을 밝히십은우리의 크고 큰 기업(基業)을 도우려는 것이오. 已予惟小子, 不政替上帝命. 天休于寧王, 興我小邦周• 寧王惟卜用,克緩 受炫命. 今天其相民, 短|亦惟 卜用. 鳴呼 ! 天明長, 弼我丕丕基. 임금의 훈시이니 문고(文告)일 수도 있다. 어떻든 그 시대 중국 사 람들의 일상용어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Ii'서경』은 사관(史官)의 기록이라 하여 사실을 기록한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마는 실은 허구적(虛構的)인 굳이 대부분이다. 『서경』의 글들은 임금이나 신하들의 말은 들어 보지도 못한 후세 사 람들이 옛날 자료를 주워모아 칙접화법으로 엮어놓음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인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12 편 중에는 한 사람의 말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도 한 대목이 시작될 때마다 「王 曰」, 「王若曰」 또논 「公曰」이란 말을 거듭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글들이 단편적인 자료를 주워모아 놓는 데서 빚어전 현상 인돗 하다. 또 단편적인 옛 굳울 기초자료로 하여 엮은 것이기 때 문에 지금 와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도 많고, 후세의 문장처럼 매끄럽지 못하다. 물론 그 원인은 후세에 전하고 베끼고 한 사람들 에 의한 착란도 있을 것이다. 어떻돈 옛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편이 이루 어질 때 처자에 의하여 재구성되었다는 것은 주의해야만 할 접이다. 이 허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편의 구성 내용들은 〈사실율 기록 한다〉는 중국 산문의, 이른바 〈기사(紀事)〉 23) 의 성격에 대하여 재고 를 요하게 한다. 사실을· 기록한다고 하면서도 작자의 상상력에 의 한 사실의 재구성이 일반적이므로, 이것은 오히려 역사자료로서의 성격으로는 문제를 지니게 되고 반대로 문학적인 성향은 풍부하게 만돈다. 이 대문에 본시 『서경』의 굳온 천자(天子)를 위한 정치 참 고자료로 씌어졌고, 후세에 와서도 굴이란 정치나 사회 · 교화에 효 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문론(文論)을 내세우면서도 중국산문은 문학 적인 발전을 거듭했던 것 같다. 이러한 가장 좋은 보기로 〈주서〉 금등(金脈)편의 끝 대 목을 돈다.
23) 明 徐師曾 『文體明辯』 참조 .
가을에 곡식이 크게 여물고 거뒤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큰 벼락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넘어지고 큰 나무가뽑 히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은· 대부들과 더불어 모두 예 복을 갖추고 쇠로 봉해 놓은 퀘짝 속의 글을 열어 보았다. 이에 주공이 스 스로의 할 일이라 생각하고 무왕에 대신하여 죽게 해 달라고 하였음을 알 게 되었다. 이공과 왕이 곧 사관과 여러 담당관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물~ 그. 들온 대답하기를 「정말입니다. 아아 ! 주공께서 명하시어 우리는 감히 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하였다. 왕은 글을 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이첸 삼가 접쳐 볼 것도 없다. 옛날에 주공은 왕실을 위해 수고몰 하셨는데, 오직 이 어란 자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지금 하늘이 위엄올 드러내십으로써 주공의 덕을 밝혀 주신 것이
다. 이 소자인 내가 그분을 천히 맞아들아는 게 우리 국가의 예에도 합당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교외로 나가니, 하늘은 곧 비를 내렀고, 반대로 바람이 불 어 곡식이 모두 일어섰다. 이공은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모든 넘어졌던 큰 나무둘을 모두 일으켜 세우고 복을 돋아주게 하였다. 그 해는 크게 풍 년이 들었다. 秋, 大熟未獲, 天大雷證以風, 禾盡個, 大木斯拔, 邦人大恐.王與大夫盡 弁, 以啓金服之書, 乃得周公所自以爲功, 代武王之說. 二公及王, 乃問諸史與 1-·執事, 對曰 : 信. 慮 ! 公命, 我勿政 言 . 王執習以泣曰 ; 其勿穆 卜. 昔公勤勞王家, 惟予沖人, 弗及知. 今天動威, 以彰周公之德. 惟股小子, 其新逆, 我國家禮亦宜之. 王出鄕 天乃雨, 反風, 禾 FLL J盡起. 二公命邦人,凡大木所低, 盡起而築之, 歲則大熟. 이는 주공의 후손인 노(魯)나라 사람들이 주공의 덕과 업적을 홈 모하는 나머지 지어낸 소설과 같은 글이다. 『서경』에는 이 밖에도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서술한 허구적인 굳이 여러 군 데 있다. 그리고 옛 성왕의 업적이나 덕을 기리거나 결(架) • 주(討) 같은 폭군의 정치를 형용한 대부분의 굳도, 그 편을 재구성한 작자 의 상상력에 의하여 이루어전 허구성이 강한 글이라 보아야 할 것 이다. 〈상서〉의 당서(湯誓) • 고종융일(高宗影日)·서백감려(西伯戱黎)· 미자(微子) 등 편의 편폭이 비교적 짧고, 반경(盤庚) 상 • 중 • 하는 각각 때와 장소가 다른 곳에서 한 말이라 해석하나 실상 내용은 중복되는 감이 있다. 이것은 송(宋)나라 사람들이 노나라 사람들 보다도 옛날 자료에 더욱 충실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상상력이나 문장의 구성력에 있어서는 노나라 사람들보다 뒤졌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주서〉의 12 편 이외에는 여형 (呂刑)의 문장이 이것들과 비슷한 성 격의 것이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전 글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는 모두 이보다 뒤진 것이다. 〈상서〉의 편들 속에는 오래된 자료를 활용한 혼적이 있으나 완전한 편을 이룬 것은 이 12 편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완전한 서술문(奴述文)으로 이루어전 우공 ( 禹:Q)· 홍범(洪範) 같은 것은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것일 것이며, 서술문이 비교적 많이 섞인 요전( 堯典) • 금동(金脈)과 나머지 편둘도 일부는 전국시대, 빨라야 춘추시대에 이루어진 것들로 보여진다. 그것은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수사도 발달하고 있으며, 직접화법은 대 화에 가까운 표현들이 활용되고 있는둥, 문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느껴진다. 보기로 우선 〈요전〉의 첫머리를 읽어 보자. 옛날울 상고해 보건대, 요임금은 방훈이라 불렀었으며, 꽁겅스럽고 총 명하고 우아하고 생각이 깊으시어 oJ :온하셨다. 진실로 공손하고사양하셨 으나, 그 빛이 온 사방에 퍼져서 하늘에서 땅에까지 뻗쳤었다. 큰 며울 밝히실 수 있으셔서 온 집안을 천화케 하셨고, 온 집안이 화목 케 된 다음에는 백성울 공평히 다스리셨고, 백성이 밝게 다스려지자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으며 , 서민들도 이에 교화되어 화평을 누리었었다. 曰 若稽 古, 帝堯曰放ifi)J, 欽明文思, 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克明俊德, 以親九族;九族槪睦, 平章百姓;百姓昭明, 協和萬邦;黎民於 變時雍 . 이 대목의 후단은 묵히 압운(押韻)까지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 볼 때 운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밝다」는 뜻의 〈明〉자는 세번이 나 나오고. 또 비슷한 뜻의 〈章〉 • 〈昭〉 등도 보이며. 〈協〉 • 〈和〉 • 〈雍〉과 〈欽〉 • 〈恭〉 둥도 비슷한 뜻을 지닌 글자들이다. 이 굴은 뜻 의 전달보다도 문장의 수사에 너무 신경을 썼고, 또 요임금의 덕과 업적을 과장하면서도 뜻은 애매한 글이다. 물론 이러한 애매성은 좋게 보면 함축적이라고도 하겠지만,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말로는 문제가 많은표현이다. 다음엔 대화로 이루어진, 같은 〈요전〉의 한 대목을 보기로 돈다. 임금 누가 시국을 따라 등용할 만하겠소? 방재 맏 아드님 주가 총명 하웁니 다. 임금 아 ! 불성실하고 말다툼만 찰 하는데, 괜찮겠소?
임금 누가 나의 일을 잘 처리해 주겠소? 환두 예 ! 공공이 많은 일에 공로룹 이루고 있읍니다. 임금 아! 말을 찰하지만 써보면 다르고. 걷온 공손하나 속은 오만하기 짝이 없소. 임금 아 ! 사악이여 ! 념실거리는 장마물이 널리 해를 끼치고, 질편한 물이 산울 삼키 고 언덕 을 참기 게 하여 홍수가 하늘에 닿을 듯하오. 아태 백성들은 이를 란식하고 있으니, 이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있겠소? 여럿 예 ! 곤이 있읍니다. 임금 어어 ! 안되오 ! 명을 어기고 착한 이들을 해철 거요. 사악 써보십시오. 시험해 보아 괜찮으면 그만 아닙니까? 임금 가서 공경히 일하시오 ! 구년 동안 일을 하였으되 이문 게 없었다. 帝 曰;磨咨若時登庸? 放齊曰; 胤子朱啓明. 帝 曰; 呼! 器說 可平? 帝 曰;晴咨若予采? 縣完曰; 都! 共工方鳩傷功. 帝 曰; 呼! 靜言庸違, 象恭浩天. 帝 曰 ; 咨 ! 四岳 ! 湯湯洪水方~J, 蕩蕩懷山襄陵, 浩浩活天. 下民其咨, 有能伴父? 倉 曰;於! 絲哉! 帝 曰 ; 呼 ! 回諸t ! 方命祀族. 岳 曰; 弄哉 試可乃巳. 帝 曰;街 欽哉! 九載續用弗成. 첫번째 방제와의 대화는 선양(禪讓) 사상, 두번째 환두와의 대화는 관리는 걸과 속이 같은 성실한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일반 원리 를, 끝머 리 사악과의 대화는 옛 날의 홍수(洪水) 전설과 곤@系)의 치 수(治水) 실패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후세에 꾸며진 게 분명한 대화 이다. 이처럼 짧은 대화의 연속도 일상용어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님
은 물론, 대부분이 네 글자씩 짝지어지는 말 들 이어서 옛날 죽간 ( 竹 簡 ) 의 제약을 느끼게 한다. 공연한 감탄사와 형용어가 기록된 사실 에 비해 많은 것도 수사 (修辭) 의식 때문인듯 하다. 그러면서도 대 화의 끝 머리만 보더라도 임금은 곤을 동용하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곧 바로 곤에게 「가서 열십히 일하라 . 」는 뜻의 말을 하고, 또 「구년 동안 일하였으되 치수( 治 水)를 하지 못했다.」는 서술을붙이고 있으 니 비약이 십하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대화들온 실제로 많은 사상 과 여러가지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도 셨 다. 독자에 따라서는 여 키에서 여러가지 정치사상이나 윤리사상을 축출(抽出)할 수 있을것 이고. 또는 곤에 관한 전설을 소설처럼 크게 부풀릴 수도 있을 것 이다. 여기에 인용한 대화들을 그럴싸하게 번역을 해놓기는 하였지 만 사실은 확실한 그 뜻을 알 수 없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 문장 이 이처럼 간결하고 잘모르는 곳조차여러 군데 있는데도 거기에서 여 러가지 사상이나 교훈을 얻어낼 수 있고 또 풍부한 전설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적이라 표현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문장의 암시성 또는 함축성은 『서경』의 문장이 지니는 전 반적인 특칭이다. 이 장에 인용한 어떤 짧은 글을 보더라도 표현이 애매한 대신 거기에는 문면(文 面) 에 나타난 뜻 이의의 많은 뜻이 담 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기로 멘 앞의 대고(大話)에서 인용한 글만 보더 라도 임 금의 〈 소자(小子) 〉 라는 자칭 , 〈하느님 (上帝) 〉 과 〈 하 늘(天 )〉 과 〈 하느님의 명 (命)〉 , 무왕(武王)에 대한 〈영왕( 寧 王)〉이란 칭호, 접야)을 치는 뜻 등 몇 가지 단어만 들어도 거기에는 엄청난 사상과 종교와 윤리 및 고대사회의 풍습 둥을 연상케 한다.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모호성 또는 애매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떻든 중국 문장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굳어진다. 이상 얘기한 『서경』의 문장의 특칭인, 문체가 간략하면서도 수식 적이고 함축적이라는 것은 운문이나 시에 동하는 특칭이다. 사실 수사가 좀 더 발달한, 『서경』의 바교적 후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이는 편들의 글들올 보면 운문과 구별이 어려운 표현이 많다. 이미 앞에 보기로 돈 〈요전〉 첫머리의 굳이 그러하였지만 직접화법으로 쓰인 대화 속에도 그런 특성이 발견된다. 고요모( 阜 陶謀) 끌머리
(지 금의 益稷편 꾼머 리 ) 에 는 순 @t )과 고요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노래가 보인다• 임금노레 신하가 기 쁘게 일하면 임금이 홍성해지고 모든 관리들도의무 다하리로다. 고요노래 임금님이 밝으시면 신하들도 훌륭해지고 모든 일 편안해지리로다. 다시 임금님이 참달고 멍청하면 신하들은 게울러지고 만사에 실패하리로다. 帝歌; 股賊 喜就 元首起哉, 百工熙哉. 阜 陶; 元首明哉, 股賊良哉,庶事康哉. 又; 元首遊睦哉, 股脇情哉, 萬事頭哉. 한 귀철만이 5 자일 분 나머지는 모두 한 귀가 4 자인 소박한 표현의 가사이다. 그러나 〈요전〉(지금의 舜典)에도 이 노래 가사에 못지 않 은 형식의 글이 보인다. 법으로 형벌 정하여 보여주시되; 귀양살이로 오형(五刑)을 너그러이 하시고, 매로써 관청의 형벌을 삼고, 최초리로 교육의 형벌을 삼고, 돈으로 형벌을 대속(代照)케 하셨다네. 실수와 재난은 용서하였으나, 고의로 끝내 악한 자는 사형에 처하셨다네. 象以典刑; 流有五刑, 綾作官刑, 朴作敎刑, 金作讀刑. 省災律敎, 佑終賊刑.
다음에 는 〈고요모〉 첫 머 리 의 고요와 우(禹)의 대화를 보자. 옛 날을 상고하여 보건대 말하였다. 고요 진실로 그의 덕을 추구하면, 괴하는 일 밝아지고 보팔하는 이들 조 화될 것입니다. 우 그렇지요. 어렇게 하면 되지요? 고요 그의 몸 닦는 일을 삼가고 생각을 길게 하면, 온 집안의 질서 잘 잡히고, 모든 사람들 밝아져 보좌하기에 힘쑬 것이니, 가까운데로부터 먼 곳까지 잘 다스리는 길이 여기 있읍니다. 우 (훌륭한 말에 절하면서) 그렇습니다 ! 고요 아아 ! 사람들을 아는 데 달렀으며,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 달렀읍니다. 曰若稽古, 阜陶 曰; 允迪歡德, 謨明弼諸. 禹曰;兪, 如何? 阜陶 曰 ; 都 ! 愼歡身修思永, 悼叔九族,庶明勘翼, 還可遠在炫. 禹拜昌言曰;兪! 阜陶 曰 ; 都 ! 在知人,在安民. 이것은 손 닿는 대로 인용한 대화이지만, 문장은 운문에 가까운 것 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臣}로 된 귀철둘이 중 십 을 이 루며 , 고요의 말의 〈族〉 • 〈翼〉과 〈人〉 • 〈民〉은 운을 밟은 돗한 느낌마저 돈다. 원칙적으로 중국의 옛날 사람들은 『시경』 계 통의 〈노래의 가사〉와 『서경』 계통의 〈읽는 굳〉의 구벌은 하였지만 지금 우리처럼 문장을 놓고 시와 산문으로 구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곧 이들은 『시경』과 『서경』의 문장을 문학상으로는 같은 글 이라 보았기 대문에 이들의 문장으로서의 특칭은 공통접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시와 산문이 형식상으로도 상당히 서로 접근하고 있 논것이다.
4. 후세 문학에의 영향 『서경』온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행해전 시대라고 떠받돈 요순(堯舜)과 삼대 (三代)의 성 군(聖君)의 행적 과 그들의 정 치 에 관한 자료를 모아 놓은 유가의 경전이어서, 중국역사를 통하여 정치와 문화 전반에 끼찬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그 후세 문학에의 영향은 어떠했는가를 앞 의 논술을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서 겅』은 가짜 『고문상서』에 가짜 『공전』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중 28 편만이 진짜라 하였지만, 이것은 천여년을 두고 널리 읽혀져 왔 기 메문에 그 가짜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작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독히 중국의 산문은 언제나 『서경』을 최고의 규법으로 삼아 왔 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것처럼, 중국문장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사(修辭)는 같은 『서겅』의 편들 중에서도, 서주(西周)에 이루어진 것이타 생각되는 것들보다는 동주여構])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논 것들이 필싼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의 수식은 계 속 발달하여 진(秦) • 한(漢)을 거쳐 위(魏) • 진(晋) • 남북조(南北朝) 에 이르러 거의 운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변려문(耕岡文, 또는 耕文) 올 이문다. 그것은 한대에 성행하였던 부(試)도 직접적인 영향을끼 쳤지만, 수사의 추구를 동한 문학의 가능성은 이미 『서경』이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당예f)대에 들어와 〈변려문〉을 반대하고 〈고
문(古文)〉울 주장하던 사람들이 혼히 『서 경 』울 고문의 본보기 로 내 세 웠었다• 『서경』 중에서도 특히 서주의 작품일 것이라고 한 〈주서〉의 12 편이 가장 중시되었다. 이 12 편의 굴은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곳 이 많으며 문장도 화사하지 않지 마는, 쓰고자 하는 생 각이 나 일을 솔직하고 꾸밉없이 표현한 문장의 수법을 높이 평가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경』의 문장이 지닌 간결성이나 암시성은 중국의 산문 울 운문이나 바숫한 〈변려문〉을 이루는 데에도적지 않은작용을 했 겠지만, 〈 고문〉에도그러한문장수법은그대로전승되어 중국산문의 특칭을 이루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지은 글이란 다른 사람이 한 글자를 더 보탤 수도 없고 한 글자를 빼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 혼히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고로 간결한 표현을 한 글 이라면 거기에 다론 한 굳자나 한 귀철을 덧보태떤 그것은 쓸데없 는 글자나 귀철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문장의 균형이나 아름다 움을 손상시킬 분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그 굴에서 한 글자를 빼면 그 한 글자 만큼의 뜻이 줄어들고 또 균형이나 아름다움이 무너지 는 것 이 다. 보기 로 고문대 가인 한유(韓急 768~824) 의 『송왕수재 서 (送王秀才序)』란 글을 읽어 보자. 내가 어렀을 때 『취향기』 U) 를 읽고 속으로노 숨어사는 사람들이 속세에 대하여 아무 미련도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얘기가있 게 된 것은 어찌 진실로 술을 찬미해서이겠읍니까? 나는· 완적(阮籍)과 도참(陶浴)의 시를 읽고서야 겨우 그들은 고답져이어서 세상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평단할 수가 없었고 어떤 때는 사 물이나 시비(是非)의 자극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안회여i 回)가 가난한 생활 속에도 줄거움을 잃지 않았고 'Z5) 증삼(曾參)은 헐벗었 어도 노래소리가 악기에서 나는듯하다 하였읍니다 .26) 그들은 성인(聖人) 울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쉴새없이 공부하면서도 언제나 미치지 못하 논 것 같았읍니다. 그들온 실천 행동에도 본시 겨를이 없었거늘 또 어찌
24) 唐 王敏이 그의 이상사회를 그린 채 . .:Z. 사회는 사람둘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술이나 마시며 쥴기고 산다.
25) 『 論語 』 雍也편에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한 말.
26) 『莊子』 讓 王편의 기 목을 근거 로 한 말.
술에 의지하여 숨어 제상을 도피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또 이 때문에 『취향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인을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게 되었읍 니다. 당나라 덕종(德宗)은 천자의 자리를 계승하자 곧 정관(貞觀) • 개원(開 元 )27) 의 위내한 업적운 이루려 하시어, 조정의 신하들은 다두어 정사에 관해 진언 (進言)하였 읍니 다. 이 때 에 『취 향기 .!l의 후계 자들은 곧은 말을 한 때문에 벼술자리에서 쫓겨났었읍니다.
27) 貞觀온 唐 太宗의 年號, 開元온 唐 玄宗 前半期의 年號 · 모두 太平盛世를 이 루었 던 시대로 유명하다.
나는 『취 향기』의 문장윤 숟퍼 하거 니 와, 한편 훌륭한 신하들의 충렬 (忠烈)을 존경하여 그런 이들의 자손을 알게 되기 바라고 있읍니다. 지금 선성께서 나를 만나러 음에 가져온 것도 없으나 나논 선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더우기 선생의 글과 행동은 조상들의 지조를 잃지 않아 완전히 단 정하고도 돈후합니다. 애석하게도 내 힘으로는 선생을 떨치게 할 수가 없 고. 또한 내 말은 제상에서 믿어주지도 않고 있으니, 선생이 떠나감에 있어 나는 함께 술이나 마시게 된 것입니다. 吾少時讀醉鄕記, 私怪隱居者無所累於世, 而猶有是言, 堡誠旨於味邪 ? 及 殿阮籍·陶潛詩, 乃知彼難個迷, 不欲與世接,然猶未能平其心, 或爲事物是 非相感發. 若顔氏子操甄與筑,曾參歌聲若出金石. 彼得聖人而師之, 級級 每若不可及, 其於外也固不假, 尙何超梨之託, 而뮴冥之逃邪? 吾又以爲悲 醉鄕之徒不遇也. 建中初, 天子嗣位, 有意貞觀·開元之丕縱, 在廷之臣爭言事.當此時, 醉 鄕之後世, 又以直廢. 吾旺悲醉鄕之文辭, 而又嘉良臣之烈, 思識其子孫. 今子之來見我也, 無 所j~, 吾猶將張之. 況文與行不失其世守, 海然端旦厚. 借平吾力不能振之, 而其言不見信於世也, 於其行姑與之飮酒! 사람울 전송하는 굳이지만 찰가라 몸조십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왕수재(王秀才)는 벼슬길이 여의치 않아 작자와 이별하게 된 돗하다. 이벌주를 마시면서도 술이나 마시며 세상을 숨어 살지 말 고 성인의 도리를 지키기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말 간결하 면서도 힘 있고 여운(餘韻) 많은 글이라, 여기에서 한 글자라도 더
보태거나 데버탈 수가 없을 것 같다• 올바론 정치를 하려는 천자가 자리에 있을 적에도 강칙한 사람은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기 쉬운 것 이니 낙담 말라는 뜻도 불과 몇 굳자로 간곡히 드러내고 있다. 『서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직접화법도 후세의 사서(史 합 )는물론 사실을 기록하는 수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Ii'한서』 예문지(藝文 志)에서 『좌전(左傳)』은 〈일을 기록한 것〉이라 하였지만, 여기에도 도처에 직접화법을 활용하여 생동하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십어 주고 있는 것은 Ii'서경』의 수법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법 은 뒤 의 Ii'전국책 (戰國策)』 • Ii'사기 여璋 3) 』 • 『한서 (漢 書 )』를 비 롯한 사서들은 물론 보통 산문에서도혼히 발견된다• 어떤 주인공에 관계 되는 일은 제삼자(第三者)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보다도 그 주인공 의 입을 통하여 그때의 상황대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칙정적인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보기를 들면 유종원(柳宗元, 773~819) 의 『종수곽락타전(種樹郭菜蛇傳)』도 거의 전 편이 직접화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끝머리의 대화 부분을 아래 에 인용한다. 묻는 사람 당신의 도리를 관청의 다스립에 옮겨도 되겠소? 곽탁타 저는 나무 심기만을 알 따름이오, 관청의 다스립은 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고을에 살면서 벼슬아치들을보니, 그들은 명령을 번거로이 하기를 좋아하는데, 백성을 매우동정하는 듯하지마는 마침내는 화를 미치게 하고 맙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소리치기를 「관 청의 명으로 너희듄의 발갈이를 재촉하고 너희들의 곡식 십기를 힘쓰게 하고 너희들의 수확을 독려하며, 속히 누에에서 실을 뽑고 속히 천을 짜 며 , 너희 들 어 린 것들을 부양하고 닭 • 돼 지 를 찰 기 르도록 하려 한다 ! 」 합 디다. 북을 울려 백성들을 모으고, 막막이를 쳐서 백성을 소집하기도 합 니다. 우리 백성들은 밥먹던 것도 중지하고 관리들을 대접하기에 겨를이 없을 정도인데, 또 어짜 우리 생활을 풍성케 하고 우리 본성을 편안케 하 겠읍니까? 그러므로 고통스럽게 여기며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저 의 칙업과 비슷한 접이 있는 것입니까? 묻는 사람 (옷으면서) 매우 훌륭하지 아니한가? 나는 나무 기르는 법 올 물었다가 사람 기르는 술법을 배웠다 !
問 者 曰;以子之 道 , 移之官理 , 可 平 ? 蛇 曰; 我知種樹 而已 , 官 理 非 吾業 也. 然吾居鄕 , 見 長 人 者 , 好須其 令, 若 莊恨焉 而卒以 禍 旦暮 吏來 而 呼 曰; 官命 保爾 법. t, 曲爾植, 탬 爾 稷 ; 盜 操 而 緖 , 쿄織而樓 , 字 而幼 孩. , 遂 而 鷄)% . 鳴鼓而衆 之, 擊木而召之 . 吾 小人 綴 娘 몇 以 勞吏 者, 旦不 得~ . 又何以 蕃 吾 生而 安 吾 性邪 ? 故 病 旦窓. 若是 則 與 吾業 者, 其 亦 有 類平? 問者暗曰 ; 不亦 善 夫 ? 吾間 義 樹 待義 人 0 ti . 이러한 직접화법이나 대화의 활 용은 위의 보기를 동해서 알 수 있듯이 한편 허구적안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역 할 도 하고 있 다. 이에 비하여 간접화법의 활용은 후세에 와서도 발견하기조차 힘든 정도이다. 이 밖에도 『서경』이나 비슷한 시대에 그 일부가 이루어전 책 으로 『역경( 易 經)』이 있다 . 『역경』은 본시 접 책 으로, 도합 64 개의 괘 (卦 ) 와 각 패의 길흉울 얘기한 패사 (卦辭 ) 2 8) 및 각 효 (~)2 9) 의 길흉울 얘 기한 효사(交辭)로 이루어쳐 있다. 이 밖에 단전(家傳) 상 • 하, 상 전( 象 傳) 상 • 하, 문언(文 言 ), 계사 ( 藥 辭 ) 상 • 하, 설괘(說卦), 서괘 (序卦), 잡괘 (雜卦) 등 〈십 익 (十 翼 )〉이 라 부르는 10 편의 굳이 덧 붙여 있다. 여〉는 문자가 아니니 별문제로 치고, 〈 패사〉와 〈 효사 〉 는 옛 부터 주나라 문왕(文王)이 지온 것이라 하나, 대략 서주 초기에 이 루어진 것이라 보아도 돌림없을 것이다• 〈 십익〉온 공자가 지었다고 하나 이는 더욱 후세에 이루어진(대략 전국 말엽부터 한나라 초기 사 이 )30) 글들로 보인다.
28) 乾릅 共 : 처럽 - 또는 --가 세개씩 위아태로 포개어쳐 있는 것, 이 -와 -- 의 결합은 여러가지로 변화시키면 64 卦가 나온다.
29) 父는 각 卦의 - 또는 -- 한개 를 가리킴.
30) 李鏡 池논 『易傳探源』에서, 家傳 • 象 傳온 秦漢間의 齊 魯地方 儒流에 의하여, 繁 辭 • 文 言 온 『史記』 作者 司 馬遷 (B . C . 145~BC . 86) 이후 漢 昭帝와 宣 帝 (B . C . 86~ B.C.4 9 ) 사이의 시대, 說卦·序卦·雜 卦 는 昭帝·宜帝 이후시대에 지어진 것이라 考證하고 있다.
『역경』 중 시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글은 〈괘사〉와 〈 효사 〉 이나, 이것들은 본시 정패의 말이기 때문에 글귀가 짧으면서도 여러가지
해 석 이 가눙하도록 알듯 모를듯한 오묘한 표현으로 이 루어 져 있 다. 따라서 지 금까지 도 사람들이 가끔 글을 쓰는 데 인용하는 유명 한 구 1 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장 자체는 오히려 후세 문학에 직 접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십익〉의 글들, 특히 〈계 사〉 • 〈문언〉 같은 것은 『여(易)』의 원리를해설한, 곧 우주와형이상 학에 관한 이론적인 굴이기 때문에 후세 유가사상에 큰 영향을 끼 찬다. 그리 고 『역 경 』은 근본적 인 64 괘 나 @사 사〉 또는 〈효사〉보다도 후세에 이루어전 〈십익〉 때문에 뒤에는 유가 겅전 중 철학적인 자 료로서 중시되게 된다. 다만 여사〉나 〈효사〉의 글이 알기 어려우면서도 운문에 가까운 글이 많은 것은 역시 주초 산문의 특칭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산문의 근원은 『서경』에서 찾는 게 옳 을 것이다.
〈참고도서〉 『함經蔡傳辨正』 4 冊, 朝鮮 沈大允 撰. 『尙홉古社』 8 卷, 朝鮮 申維 撰, 1825. 『尙 書 二十五篇』 1 冊, 朝鮮 申緯 撰, 1825. 『합經疾 書』 1 冊, 朝鮮 李演 撰. 『尙 困講義 』6 卷, 朝鮮 李합九 撰, 1824. 『尙 書 古訓』 (『丁茶山全 梨』 經渠 二染, 卷 21~26) 朝鮮 丁若鏞 撰. 『 書經(注譯 )』 韓國 金學主(光文社, 1967). 『 찬經 (注譯)』 韓國 車相線(明文堂, 1971). 『尙 캄 正義』 20 卷, 孔安國 傳, 孔類達 疏(『十三經社疏』 本). 『 書菓傳』 6 卷, 宋蔡沈 撰. 『尙 書輯錄墓社』 6 卷, 元 范鼎 撰. 『古文尙 합疏證 』 8 卷, 淸 闇若珉 撰. 『尙 書今 古文証疏』 30 卷, 淸 孫星衍 撰. 『尙 書後案 』 30 卷, 淸 王鳴盛 撰. 『 書 古微』 12 卷, 淸 魏源 撰. 『今文尙 書經說考 』 32 卷, 淸 棟喬縱 撰. 『尙 書 大傳輯校』 3 卷, 淸 陳壽祖 撰. 『今文尙 書考證 』 30 卷, 淸 皮錫瑞 撰. 『尙 웁釋義 』 民國 屈萬里 撰(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刊). The Book of Documents , Bernhard Karlgr e n, Sto c kholm. The Shoo Ki ng , Jam es Leg ge (The Chin e se Classic s Vol. 3), Rep r in t , Univ e rsit y of Hong Kong Press, Hong Kong ,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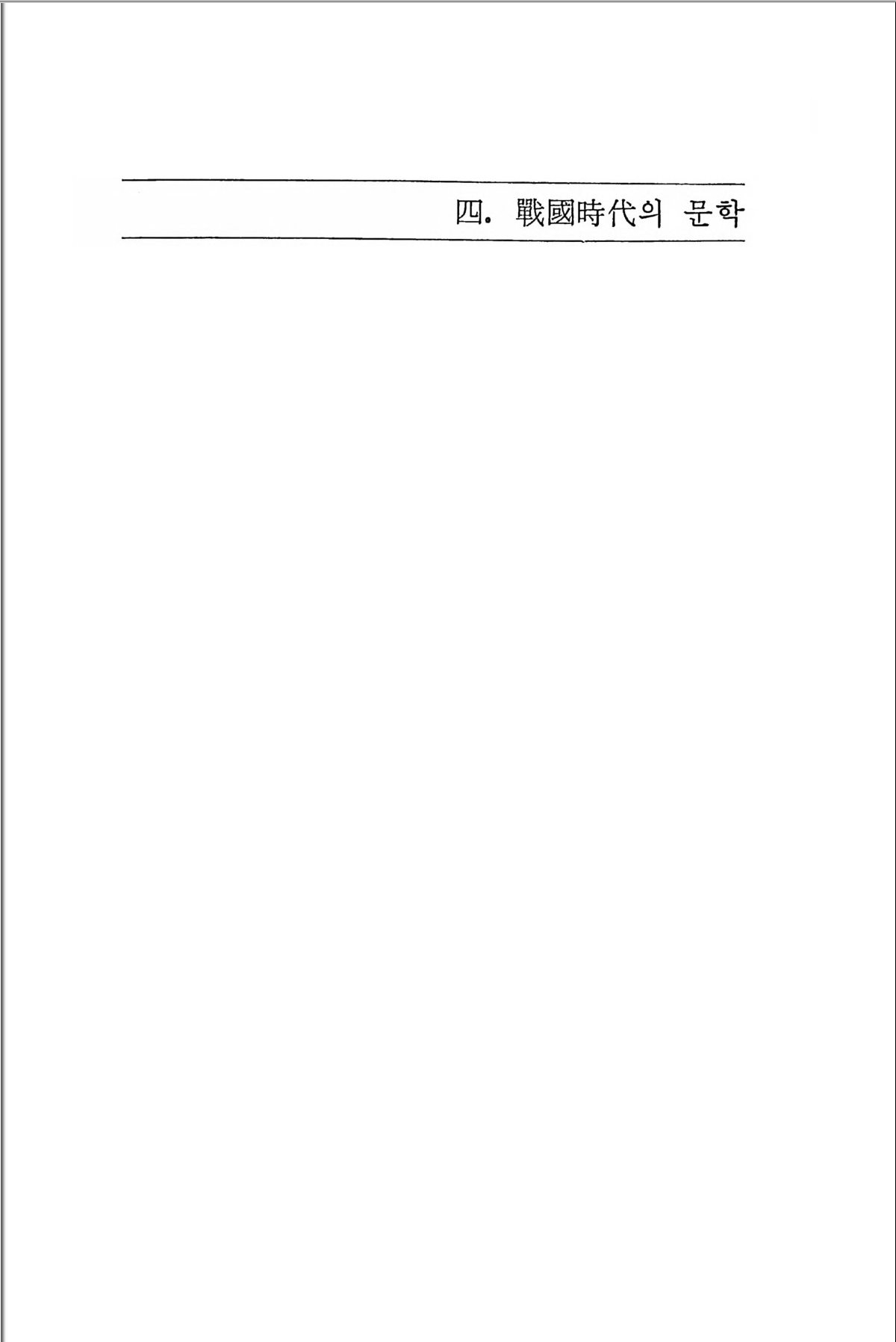 四. 戰國時代의 문학
四. 戰國時代의 문학
1. 〈紀事〉의 굳 〈기사〉의 글이란 어떤 사실의 경과를 기록한 것이나 또는 그러한 문체를 가리키는데 ,1) 특히 고대문학에 있어서는 『서경』을 비롯하여 『좌;;,J』 • Ii'국어』 • Ii'전국책』에서 다시 Ii'사기』 • Ii'한서』로 이어지는 일 련의 역사서(歷史 書 )라고 생각되어 온 기록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 사서〉란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이 책들의 내용이 역사를 기록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미 『서경』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다루는 책들은 모두 사관의 기목을 근거로 하여 편찬한 것이라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사실 (史實)을 빙자한 허구적인 얘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히 논술한 예정이다.
1) 明 徐師曾 『文體明辨』 紀먀 : 「接紀店섭, i d 志之別名, 而野史之流也. 古者, 史官 掌記時事, 而耳目所不速者, 往往越 焉 . 於是文人學士遇有見聞, 隨手紀錄,或以備史 官之採擇, 或以碑史籍之造亡, 名猛不同, 其爲紀事一也. 」
여기에서 옛부터 모든 중국 학자들이 가장 존중하여 온 『춘추(春 秋)』를 생 략하고 『좌조L 』부터 논술울 시 작한 것은, 중국문학사에 끼 찬 『춘추』의 영향이나 그 의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되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Ii'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춘추곡량전(春秋 穀梁傳)』도 같은 이유에서 생략되었다. 물론 이것이 사상사라면 이 것둘 모두 『좌전』 못지 않게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기사〉의 글로서 다루고 있는 『좌 XJ 』 • 『국어』 • Ii'전국책』은 모두
전국시대에 이루어전 책들이라 여겨진다. 이것들은 대체로 전국시 대 초영과 중엽 및 말영의 문장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듯하다. 따 라서 이것들은 춘추시대까지 닦여전 문장을 바탕으로 더욱 문장 의 기능이 완숙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찰 나타내 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여 기 에 서 는 각 자료의 수사(修辭)의 발전을 비 롯 하여 , 논설 (論說) • 서 술(敍述) • 서 사(托事) 둥 각 방면에 걸천 문장 으로서의 표현 기능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에 중접이 주어지리 라 생각된다. 이것은 대전체(大篠體)를 거쳐 여러 나라들에 의하여 각기 진행된 문자 발전 노력과 소전(小鉉)에 의한 문자 통일이 이루 어질 수 있게 된 문자의 발달 상황 및 그에 따른 문자사용의 보편 화와 서사(함寫) 방법의 발달 같은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소 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L 『좌전(左傳)』 〈오경 (五經)〉 중에 서 공자가 직 접 지 은 것 은 『춘추(春秋)』가 유일한 것 이 라 전해 온다. 그리 고 유가(信家)에 서 는 옛 날부터 『춘추』의 한 글자 한 구1 철 속에 는 그 시 대 (魯 [ 홍 公 元年, B.C.722~ 魯 哀公 十四年, B.C.481) 역사적인 인물이나 일에 대한 포평(襄陵)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댜켜냉의 문장을 보면 다만 어떤 임 금이i추위하고 죽고 또 전쟁에 지고 이기거나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과 자연현상에 어떤 괴변아 있었다는 일만을 간단히 기록해간 일 종의 대사기(大慕記)이다. 여기에는 『서경』에서와 같은 어떤 사람의 말의 인용이나 일의 전전을 자세히 기술한 서사적인 굳도 없다. 곧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 해도 그 사건의 배경이나 진행과정 같은 것 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춘추』는 유가사상의 발전에는 큰 영 향을 주었지만 문학사상의 의의논 크다고 분 수 없다. 그러나 우 리논 『춘추』를 통하여 고대 중국문학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다음 과 같은 두가지 접에 유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첫째 ; 이것은 공자 가노나라에 전해오는사관의 기록을근거로지었다하니, 본시 옛 사관의 기록이란 이처럼 매우 간략한 굳이었을 것이다. 『한서』 예 문지(藝文志)의 기록 때문에 마치 사관이 임금둘의 말과 행동을 모 조리 기록한 듯이 생각하기 쉬우나 옛날의 문자나 글을 쓰던 기구 둘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둘째 ; 중국 의 문장이란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도 표현 기능이 이런 정도의 수 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의 미 묘한 배경이나 사건의 전전을 자세히 정확하게 서술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이상 두가지 접에서 앞에 논한 『시 겅』고} 『서경』올 다시 되돌아볼 때, 거기에 실린 서주때나 춘추시 대에 지어졌다는 글에는 후세인의 가팔(加筆)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추축된다. 그런데 『춘추』가 후세에 널리 읽힌 것은 오히려 그것을 보충 해 설한 『좌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춘추』의 전(傳)에는 고문
(古文)과의 『 좌전』 이 의 에 도 금문(今文)에 속하는 Ii'공양전(公羊傳)』 과 『 곡량전(穀梁傳)』도 있다. 그런데 Ii'공양전』과 Ii'곡량전』은 대체로 교의해답(敎義解 答)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쳐 있다. 곧 『춘추』 원문 의 뜻과 표현방석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는 이에 대한 해답 을 하는 간단한 형식이다. 간혹 사실(史質)을 들어 설명하는 대목 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 역사적 성격과 문학적인 성격은 높게 평가 하기 어렵다. 『좌츠J』은 『춘추좌씨 전 (春秋左氏傳)』 2’ 또는 Ii'좌씨 춘추(左氏 春 秋)』 3) 라고도 부른다. 본시는 Ii'춘추』와 독립된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좌씨춘추』였는데 , 뒤 ( 東沿 초영부터)에 Ii'춘추』를 해설하는 자료로 전용되 면서 『춘추좌씨전』이 라 부르게 되 었 다고도 한다. 4) Ii'좌전』의 작가는 좌구명 (左邱明)이 라 전한다. 『논어 ( 論語 )』 공야장(公治 長) 편 에 는 공자가 좌구명 울 칭 찬하는 말이 보이 는데 , 『좌又J』의 작자가 공자와 같은 시대의 좌구명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국 시대의 작품이 룰림없으나尸 다만 한나타에 들어와 그 내용에 수 정과 가팔(加節)이 있었음에 들림없다. 그래서 강유위( 康有爲 )를 비 롯한 청 (淸) 말의 금문가(今文家)들 중에 는 십지 어 서 한 말영 유홍 (劉欽)의 위 작({爲作)이 라고까지 주장하는 이 도 있 었 다.
2) 『漢맙』 藝文志, 硏林f,Y 둥.
3) 『史記』 十二諸侯年表, 『漢합』 楚元王f성 등.
4) 劉逢錄 『左氏春秋考證.!] 참고 .
5) 特히 王安石 『左氏解』(『困,,紀聞』f F 『春秋解』), 葉夢得 『春秋考.!], 鄭桃 『六經奧 스論』웨 둥맨의 宋 代학부자터 B e이rn 것h a이r d 戰Ka國rl時 g代 re n作 은品 T임he을 A증u명th e 하n려ti c는it y學 a者nd듈 이th e 많N이at u 나 re왔 o다f . th또e Tso Chuan 에서 『左傳』의 굳을 言語學 的으로 분석하여 대략 戰國時代의 작풍임을 證明하고 있다.
『춘추』오} 『좌;;,cJ』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춘추』에 씌어있는 일이 『좌;;,cJ』에 없는 게 있고 『좌전』에 씌어 있는 일이 『춘추』에는 안급이 없는 게 있을 분만이 아니타, 『춘추』와 Ii'조}i,iJ]의 기록이 서로 어긋 나는 것까지도 있다. 이런 접에서 Ii'좌것J』은 본시 『좌씨춘추』였었는 데, 후세 사람이 이를 『춘추』를 설명 해설하는 『춘추조~ l 전』으로 개편해 놓은 것일 가능성이 질다. 또 기록된 시대도 시작은 같지마 는 끝머리는 『춘추』가 B.C .4 81 년인데 비하여 『좌전』은 13 년이나 더
많은 B.C.468 년에 맺어지고 있다 . 6) 따라서 『좌전』에 보이는 『공양 전』이나 『곡량전』처럼 『춘추』 원문의 뜻이나 표현방법 등을 설명한 부분은 후 세 사람의 가 팔 이타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 은 학자들이 『좌씨 춘추』를 가지 고 『춘추』를 해 설한 『춘추좌;;;cJ_』으 로 만든 사람이 한대의 유홍이라 믿고 있다.
6) 顧韻剛 『五德終始 說 下的政治和歷史』(『古史辨』(五) 上 編 )에서는 이 說율 이보다 積極的으로 論述 하고 있다.
7) 屈萬里 『古 籍謀讓 J] 등.
『좌전店는 한마디 로 말해 서 『서 경 』 이 나 이 전의 산문보다는 내 용이 나 문장에 있어 뚜렷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서경』이 고대의 성 현(聖府)들의 언동을 바탕으로 한 고원( 高遠 )한 이상 세계의 추구에 시 종(始終)하고 있는데 비 하여 , 『좌;;,;J_』은 유가적 인 도덕 관념 이 나 예 (禮)를 중시하면서도 현실세계에서의 치국(治 國 )의 여러가지 양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기에 『좌츠나에 나오는 임금이나 신하들은 현실적 인 인물 들 이어서, 언제나 인의도덕을 내세우면서도 적을 만나면 계 략을 써서 싸워 이기려 들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 일생을 망치기 도 한다. 『좌전』에는 시대의 혼란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묘사도 더욱 상세하고 더 욱 다져져서 세련되고 화사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 『좌;;;c,!J]의 문장을 크게 구분하면 서 술문과 적 정 화법 을 사용한 대 화의 두가지가 있다. 다시 서술문에는 앞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거나 대화의 배경을 선명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대화와 대화의 관계를 연결시키거나 설명울 보충하는 것과 『공양전』이나 『곡량전』의 경우 처럼 『춘추』의 경문을 해설한굳둘이 있다. 이러한 서술문들은 대체 로 지극히 간략하고 수식이 적은 문장들아다. 그리고 경문을 직접 해설한 짧은 글은 읽기 쉬운 굳이 많지만, 경문을 보충실명한 것이 나 그 밖의 경우의 글들은 문장이 너무나 간략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대체로 『춘추』의 경문을 칙접 해 설한 짧은 글들에는 『좌씨춘추』를 『춘추좌씨전』으로 개편할 때 보 태어전 것으로 추측되는 굳둘이 많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떤 일 울 설명한 긴 서술문은 『좌 XJ 』 전체를 놓고 보아도 극히 드물다. 양
공( 襄公) 30 년 (B .C . 542 ) 에 정 (鄭) 나라 자산 (子 産 )의 정 치 업 적 을 서 술 한 대목, 소공( 昭 公) 32 년(B. C.509 ) 에 수 축(修築) 하기로 한 주(周)나 라 성에 대한 기록 둥이 있는 것이 비교적 긴 서술문의 보기이다. 이런 간 서술문은 뎃귀도 사용하고 압운 ( 押 韻 )도 하는 등 매우 수사 (修辭 )가 발달한 굳이다. 직접화법으로 된 글에도 두세 사람의 비교적 짧 은 대화로 이루어 지는 굴과, 대화의 형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간 연 설 이 나 성명(聲明) 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십을 이루는 것들이 있 다. 이 짧은 대화들은 대체로 앞에 설명한 짧은 서술문의 도움으로 간결하고도 힘있는 문장을 구성한다. 짧은 몇 마디 대화를 통하여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나 특칭올 드러내며, 많은 뜻이 함 축 된 문장 울 이 문다. 보기 로 『좌 XJ 』 앞머 리 온공([ 접 公 ) 원년 (元 年) (B .C.721) 에서 한 대목을 인용한다. 처음에 정나라 무공은 신(申)나라에 장가들었는데, (부인을) 무강(武 姜) 이 라 불렀으며 , 장공과 공숙단 을 낳았다. 장공은 참자는 사이 에 나서 강 씨(어머니)를 놀라게 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오생( 應 生)이라 하였고 그 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숙단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여 여러번 무공에게 요청하였으나, 무공이 들어주지 않았다. 장공이 즉위하자 그(공숙단) 를 위하여 제 (制)땅을 요구하였다. 장공이 말하였다. 「재는 험요( 險 要)한 고을이며 괵숙( 號 叔)이 죽은 곳입니다. 다 론 고을이라면 명대로 따르겠읍니다.」 경(京)을 요구하니 그곳에 살게 하 고 그(공숙단)를 〈경성대숙〉이타 불렀다. 체중@닌中)이 말하였다. 「도성 (都城)이 백 치 00)8) 를 넘으면 나라의 해가 됩니다. 선왕의 제도 를 보면 대 도(大都)도 나라 수도의 삼분의 일을 넘 지 않고, 중도(中都)는 오분의 일, 소도(小都)는 구분의 일을 넘 지 않습니 다. 지 급 경 (京)은 법 도에 맞 지 않는 그릇된 조치입니다. 임금님께선 장차 감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 다.」 장공이 말하였다. 「강씨(어머니)께서 바라시는데 어찌 해 를 피하겠 소?」 대답하였다. 「강씨께서야 어찌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읍니까? 일찌 기 조치륜 하시어 피해가 자라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덩굴풀처럼 자 8) 一維는 길이 三丈, 높이 一丈되는 城의 크기 를 나타내는 單位.
타난 뒤에는 대처하기 어 렵 습 니다. 덩굴 풍 조 차 도 제거하 기 임들 거 늘 하 뭉 며 임 금 님의 사랑하시는 아 우 야 어 찌하 시 겠 읍니 까 ? 」 장공 이 말하였다. 「 불 의 를 많 이 행 하면 반드시 스스로 죽게 되오. 그대는 잠시 기다려 브 구려. 」 初 , 鄭 武公 姿 于申, 曰 武姜 , 生莊公, 及共叔段. 莊 公 痛 生, 將姜 氏, 故名 曰 昭生 , 遂 惡之. 愛共 叔段, 欲 立之, 亞 請 於武公, 公弗 許 . 及莊 公郞位, 爲 之 訪制 • 公曰 ; 「制, 巖 邑也, 號 叔 死焉 . 伯邑唯 命 . 」 請
京 , 使居 之, 謂 之 京 城 大 叔. 祭 仲曰 ; 「 都城 過百 維 , 國 之 害 也. 先王之制, 大 都不過參國 之一, 中五之一, 小九之一. 今 京 不度, 非制也, 君將 不權. 」 公曰 ; 「 姜 氏 欲 之, 焉辭害 ?」 對曰 ; 「 姜 氏何眼之有?不如早 爲 之所, 無 使 滋袋~ . 發 , 難 圖也. 薛草猶 不可除, 況君之龍弟平 ? 」 公曰 ; 「多行不義, 必 自갱 E , 子 姑 待之.」 이 대목을 읽어 보면 마치 소선 같은 구성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머 리 서 술문은 정 나라 무공의 부인 무강(武 姜 )이 큰 아들 장공을 미워하여 형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연유를 쓴 것이다. 문장에 생 략이 많아 천천히 읽 지 않으면 문맥을 잃기 쉽다. 〈 宿生(오생)〉이 란 말도 알기 힘들거니와, 누가 공숙단을 사랑했고, 어디에 세우려 하였고, 무엇을 요 청 한건지 앞 뒤 문장을 잘 연결시키지 않으면 들 리 기 쉽 다. 그리 고 장공이 아우 꽁숙단에 게 험 요( 險 要)한 고을을 주 지 않 고, 큰 경( 京 )을 주어 놓고는 「불의를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 스로 죽게 될 터이니 두고 보아타.」고 말하는 데서, 장공의 성격이 나 공숙단의 운명 같은 것이 은연중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좌전』의 문장은 특히 전쟁 의 묘사에 뛰 어 났다고 옛 날부터 일컬 어져 왔는데 , 거기에도 대화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성공며 鉉 公) 16 년 (B.C.575) 에 언롱( 堀陵 )에 서 전( 晋 )나라와 초( 楚 )나라가 싸우는 얘 기 에서 한 대목을 보기로 든다. 이 싸움에서 전나라가 초나라를 크게 쳐부수는데, 이 때 전나라 진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초 a § ) 나라 공왕( 共 王)의 대화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초왕이 높은 수레에 올라가 전나라 군전( 軍 陣)을 바타보았는데, 자중(子沮)이 대재(大宰)인 백주리(伯州梨)로 하여금 입금 뒤에 시종(侍從)로 록했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좌우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무얼 하는 거요?」 「지휘관(軍吏)둘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모두 군전(軍陣) 가운데 에 모여 들고 있소. 」 「모여서 계책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장막(帳幕)율 치고 있소.」 「공경히 선군(先君)둘 앞에서 접을 치려는 것입니다.」 「장막을 거두고 있소.」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시끄러워지고 또 먼지도 피어오르고 있소.」 「우물을 메우고 취사장(伏事場)을 평평히 하고는 전전(戰陣)을 치려 는 것입니다.」 「모두 수레에 랐는데 , 왼편의 장수와 오른편의 장교는 무기 를 들고 내려오고 있소.」 「훈시(訓示)를 하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걷어 오겠소?」 「아칙 알 수가 없읍니다.」 「모두들 수레에 랐는데 , 왼편의 장수와 오른편의 장교가 다시 내 려 오 고 있소.」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楚子登菓車以望晉軍. 子鎭使大宰伯州紹侍于王後. 王曰;賜而左右, 何也? 曰;召軍吏也. 皆衆於中軍矣. 曰;合謀也• 張蓋矣. 曰 ;皮 卜於先君也. 徹慕矣. 曰;將發命也. 莊露, l!..鹿上矣. 曰 ; 將塞井夷霞而爲行也.
皆乘矣 左右執兵而下矣. 曰;聽맙也. 戰平? 曰;未可知也. 乘而左右皆下矣. 曰;戰訪也. 이러한 대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논 생동하는 묘사 효과룬 위하여 다시 꾸민 허구적인 글일 것이다. 댜전』에 많이 보이논 예언(豫言)과 정(占)을 비롯하여 꿈이나 귀신 에 관한 얘기들을 동해 보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사건의 기록들이 대부분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필자에 의하여 허구적으 로 재구성(再構成)된 기록입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엔 꿈과 많은 관 련이 있는 기록으로 성공@戈公) 10 년 (B.C.581) 에서 한 대목을 인용 해 본다. 전후(晋侯)가 꿈을 꾸었는데 큰 역귀(疾鬼)가 머리를 풀어해쳐 땅에까 지 늘어뜨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펄며펄떡 뛰면서 말하였다. 「내 자손들을 부당히 죽이어”, 내가 하나님께 소청(訴請)을 드렸다.」 그리고는대문과 정 전(正殿)의 문을 부수고 들어 왔다. 전후는 두려워 서 방으로 들어 갔는 데 다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리고 전후는 깨어나서 상전@닫田)의 무 당을 불렀는데, 무당은 전후가 꿈꾼 것과 똑 같은 말을 하였다. 「어떻게 한다지 ?」하고 전후가 말하자, 「새 보리를 자시지 못하게 되겠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9) 晋 景公이 則位한 이 래 趙同과 趙括을 죽였으니 趙氏의 先祖 鬼神일 것 이 다어:『正 義』).
전후가 중병 이 들어 전(秦)나라에 의 원을 구하니 , 전나라 임 금은 환 (緩)이란 의원으로 하여금 그를 고쳐 주도록 하였다. 의원 환이 도착하기 전에 전후는 꿈을 꾸었는데, 그의 병이 두 아이가 되어 가지고 말을 주고 받았다. 「그는 용한 의원이라 우리가 상하게 될까 두려우니, 그로부터 도 망쳐야지.」 「명치 위 십장 아래에 가 있으면 우릴 어떻게 할 수 있을라 구?」의원이 도착해서 보고는 말하였다. 「병온 고칠 수가 없읍니다. 명치
위와 십장아래에 있어서 이물 고치려 해도 되지 않고 침을 놓으려 해도 미 치지 않으며 약도 다다를 수가 없으니 어찌하는 수가 없읍니다.」 전후가 말하였다• 「훌륭한 의원이니 두터이 그에게 예우(i0 退)를 하여 돌려보내 도록 하오.」 유월달 병오(丙午) 날, 전후는 보리 생각이 나서 농사 일을 맡은 사람 으로 하여금 보리를 바치도록 하였다. 요리사가 그걸로 음식을 만들자상 전의 무당을 불러 보리 음식을 내보이고는 그를 죽였다. 전후가 음석을 먹으려다 배가 이상하여 변소로 가서는 빠져서 죽어버렀다. 한 낮은 신하가 아침 에 전후를 업 고서 하늘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 다. 그리고 한 낮에 전후를 변소에서 업고 나오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는 순 장(狗葬)을 당하고 말았다. 晋侯夢, 大廊被髮及地, 捕『 3 而踊曰 ; 「殺余孫不義, 余得請於帝矣 ! 」 製 大門及裵門而入. 公權, 入于室, 又城戶. 公覺, 召桑田巫, 巫言如夢. 公 曰 ; 「何如 ?」 曰 ; 「不食新矣」. 公疾病, 求醫於秦, 秦伯使醫緩爲之. 未至, 公夢疾爲二堅子, 曰 ; 「彼良땝 也. 權傷我焉, 逃之. 」 其一曰 : 「居育之上, 行之下, 若我何 ? 」 整至, 曰 : 「疾不可爲也. 在育之上, 行之下, 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 不可爲 也. 」 公曰 : 「良醫也, 厚爲之禮而歸之 ! 」 六月丙午, 晋侯欲麥, 使御人獻麥. 韻人爲之,召桑田巫, 示而殺之. 將 食, 張, 如亂 路而卒. 小臣有晟夢負公以登天. 及 日 中, 負晋侯出諸廊, 遂以爲1(iJ. 소설 못지 않은 환상과 변화가 담겨있는 굳이다. 임금이 무고한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다해서 그의 조상이 역귀(疾鬼)가 되어 임금의 꿈에 나타나고, 무당은 정을 쳐서 꿈의 내용을 다 알아맞힌다. 그 리고 새 보리가 나기 전에 죽을 거라는 예언까지 한다. 병이 돈 뒤 에도 꿈에 병이 아이로 변신하여 그것이 불치의 병임을 알려주고, 또 전(秦)나라의 의원은 그것을 알아맞힌다. 이 의원은 불치의 병 임을 알아맞힌 덕분에 후한 대접을 받지만, 무당은 죽는 시기까지 알아맞힌 덕분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무고한 낮은 신하는 자기 꿈 얘기를 한 덕분에 전후의 무덤에 산 채로 함께 묻히개 된
다. 착실한 사실의 기록으로서는 이처럼 변화 많은 굳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접에서 『 좌전』은 사서(史라)라기보다는 문 학적인 처술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접화법으로 간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개 임금에게 간(諒) 하는 말이나 물음에 대한 웅대 또는 연설 • 성명(聲明) • 훈계등의 겅 우이다• 여기에서는 칙접화법이면서도 압운도 하고 대귀의 방법 도 쓰는 둥 대단한 수사의 기교가 발휘되고 있다. 환공(桓公) 2 년 (B.C.709) 에 보이 는, 송(宋)나라 화보독(華父督)이 뇌 물로 보낸 고 (都)나라의 큰 솥(大},i)을 노(魯)나라에서 받아들여 태묘(大廟)에 놓 았을 때 장애백(威哀伯)이 환공에게 간한 말을 아태에 보기로 돈다. 사람들의 임금이 된 이는 덕을 밝히고 그릇됨을 막음으로써 여러 관리 둘을 대하고 밝혀 주되, 그래도 혹시 이에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므 로 훌륭한 덕을 밝힘으로써 자손들에게 보여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묘(宗廟)가 초가 지붕이었고, 천자의 수레에 초석(草席)을깔았었으여, 제사에 쓰는 갱 @8) 에는 양념을 갖추어 쓰지 않았고, 제사밥을 짓는 곡식 은 곰게 찡지 않았던 것은 그의 검소함을 밝히려던 것이었읍니다. 곤룡 포(哀龍抱)와 면류관(冕琉冠)과 페 술(薇談 )10) 과 옥홀(玉 m) 및 허 리 며 와 바지와 행전(行聯)과 ...tJ. 및 머리 꼬지개와 면류(冕琉) 줄과 관끈과 관 두 껑온 그의 제도를 밝히려던 것이었읍니다. 채색된 욱받침 11) 과 칼집의 위 아래 장식 및 처진 꼬리 탈란 관복 며와 깃발가장자리 장식과말 가슴앞 의 장식은 그의 지위에 따른 규정을 밝히려던 것이었읍니다. 불꽃 무늬와 용무늬 와 보(顧) 무늬 와 불(徹) 무늬 l” 는 그의 신분에 다론 무늬 를 밝히 려던 것이었읍니다. 여러가지 자연 현상에 비유되는 오색(五色 )13) 은그가 쓰는 물건의 적절함을 밝히려던 것이었읍니다. 말 머리의 방울과 말재갇 양편의 방울과 수레 채 끝의 방울과 깃대에 다는 방울은 그의 행동에 따 론 소리를 밝히려던 것이었읍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려진 깃발들은·그의
10) 薇漆온 무릎이 덮일 정도로 앞가리개처럼 겉에 걸치던 다린 가죽으로만든 옷의 일종.
11) 朝台 대 儀式用으로 쓰던 가죽에 彩色운 칠한 물건으로 身分에 따라 彩色이 달 랐다.
12) 이상 모두 옛 禮 HE 에 쓰던 무늬. l:lifi는 黑白色이 엇섞인 도끼 모양이 이어진 무 늬이고, 賊은 黑靑色이 엇섞인 己字가 이어진 모양의 무늬임.
13) 집f色온 束쪽과 봄, 赤色온 南方과 여름을 나타내는 것 갈은 따위이다.
밝음을 밝히려던 것이었옵니다. 무못 덕이란 김소하면서도 법도가 있어야 하고 높고 낮은 신분에 따온 규윤이 있어야 하며, 무늬와 물건으로써 그 것을 표시하고, 소리로 표시하고 밝히어 그것을 나타냄으로씨 여러 관리 들을- 대하고 밝혀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 관리들은 그래서 경계하고 두 려워하게 되어 감히 기강(紀綱)과 법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 니다. 지금 이 덕을 괴믿시키고 그롯침을 뒷받침하셨으니, 뇌물로보내온 그릇을 대묘(大廟)에 듬으로써 여러 관리들에게 그것을 명시하셨읍니다. 여러 관리들이 그 일을 본받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수가 있겠읍니 까? 국가의 괘멸은 관리들이 미뚤어침으로써 말미암는 것입니다. 관리둘 이 덕을 잃는 것은 뇌물을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데서 옵니다. 고(部)나라 의 솜이 태묘에 있다면 뇌물운 드러내는 것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읍 니 까 ?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몰 쳐 부수고는 구정 (九鼎 )H) 윤 낙읍(維邑) 으로 옮겨 놓았었는데, 의사(義士)둘 중에는 그것조차도 미난한 이가 있 었읍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릇되고 규율을 어지럽히는 뇌물로 보낸 그릇 윤 태묘에 놓고 밝힌다면 그것은 어찌 되겠읍니까?
14) 夏禹가 九州룬 象徵하는 것으로 鑄造하여 이후 傳國의 祖器로 생각되어 商나라 에서도 代代로 都邑에 保全하여 왔었다 한다.
君人者, 將昭德塞違, 以臨照百官, 猶個或失之, 故昭令德以示子孫.是以 淸閑茅屋, 大路越席, 大溪不致, 菜食不繁, 昭其儉也. 哀冕賊礎, 1’ i隅袋幅 潟, 衡就訖 m, 昭其度也. 森率細館,梵腐游線, 昭其數也. 火龍顧載, 昭其 文也 五色比象, 昭其物也. 錫鷺和鈴, 昭其聲也. 三辰旅旗, 昭其明也.夫 德, 儉而有度, 登降有數, 文物以紀之,聲明以發之, 以臨照百官. 百官於 是平戒權而不政易紀律. 今滅德立違, 而腐其路器於大廟, 以明示百官.百官 象之, 其又何珠焉 ? 國家之敗, 由官邪也. 官之失德, 龍路草也. 部鼎在廟, 章執其焉?武王克商, 遷九鼎于雜邑, 義士猶或非之.而況將昭違亂之路器於 大廟, 其若之何? 이 말은 무척 수석적이다. 앞의 덕과 규율을 밝혀야 함을 설명한 대목 같은 데에서는 이미 한(漢)대 부에서 사물의 묘사를 포장(錦 張)하던 수법 의 싹울 보는 듯하다. 屋 • 席 • 懿 • 潟과 斑 • 緩 • 象 • 鈴. 聖·明 둥은 운을 밟은 굴자들이며, 댓귀를 이루는 곳도 상당 히 많다. 이처럼 간 말의 안용들은 앞에서 참깐 언급한 간 서술문과
함께 극도의 수사기교(修辭技巧)를 동원하여 굳을 이루고 있다. 이처 럼 『좌전』은 사실적이고 생동하는 짧은 굳들과 수식적이고 화려한 약간 간 글들이 엇섞이어 중국 고대의 문장 중 가장 문학적인 문장 울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팔자에 의하여 허구적 (庫構的)으로 재구성된 것이어서 단 순한 사실의 기록보다도 재미가 있고 깊은 뜻이 담겨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되도록 중요하지 않은 말들은 생략하여 사건의 기술에 변화가 무쌍하다. 다음엔 회공(僖公) 32 년 (B.C.628) 에 전(秦)나라와 전(晋)나라가 효(fl&)라는 고장에서 전쟁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대목을 보기로 인용하여, 이상 얘기한 『좌 XJ 』의 문장의 특칭의 일 단을 드러내 보일까 한다. 겨울에 전(晋)나라 문공(文公)이 죽었다. 경전(庚辰)날 그의 관을곡옥 (曲沃 ) 에 옮겨 놓으려 고 강(絡 )15) 올 나서 는데 관에 서 소울음 소리 가 났다. 접쟁이 언에료)이 대부들로 하여금 관에 전율하도록하고는말하였다. 「입 금님께서 큰 일에 대하여 명하셨으니, 장차 서쪽으로 우리를 앞질러 가는 군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찬다면 반드시 큰 승리를 얻을 거라 하십니다.」
15) 絲온 晋나라 都城
기자(紀子 )16) 가 정 (鄭)나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진(秦)나라에 보고하였 다. 「정나라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그들의 복쪽 변경의 문호(門戶)를 관 장케 하고 있읍니다. 만약 군대를 남몰래 보내어 온다면 나라를 얻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전(秦) 목공(穆公)이 건숙여몽叔)에게 이에 관하여 의 논하자, 전숙이 아뢰었다. 「군대를 피로시키면서 먼 곳을 습격한다는 말 온 들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군대는 지치어 힘이 다하게 되고 먼 곳의 임금은 이에 대하여 대비하게 될 것이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옵니까? 군대의 움직임은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니, 정나라도 반드시 그것 울 알게 될 것입니다. 노고를 하면서도 얻는 게 없다면 반드시 군사들은 불평스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리나 행군을 하는데 그 누가 알지 못하겠읍니까?」 목공은 이 말을 무시하고, 맹명(孟明)과 서결(西 乞)과 백 을(白乙)을 불러 동문(東門) 밖에 군사를 소집 하여 출동·하도록 하
16) 祀子는 秦나라 大夫, 鄭나라를 위하여 軍隊를 거느리고 守備해 주고 있었다.
였다. 그러자 전숙은 울면서 말하였다. 「맹(孟)장군 ! 나는 군대가 출동 하는 것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보지 못할거요 ! 」 목공은 사람을 시켜 그에게 이형게 말하였다. 「그대가 무열 아는가?살 만큼 살았 으니 그대를 무덤으로 데려갈 관은 이미 마련되었겠지 ! 」 전숙의 아들도 출동하 는 군대 속에 있었는데. 곡을 하면서 아들울 전송하며 말하였다. 「전(晉)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효(敬) 에서 전(秦)나라 군대를 막을 것이 다. 효에는 두 능(陵)이 있는데, 그 남쪽 능은 하(夏)나라 임금 고( 泉 )17) 의 무덤이고, 그 북쪽 능은 문왕(文王)이 빗바람을 피한 일이 있다는 곳 이다. 너는 반드시 이 사이에서 죽을 것이니, 내가 너의 뼈를 거두도록 하마 ! 」 그리고 진(秦)나라 군대는 마침내 동쪽으로 출동하였다.
17) !j1,는 夏나라 祭王의 祖父, 夏朝 15 代王으로 B.C.1848 年부터 11 年間 王位에 있 있다.
冬, 晉文公卒. 庚辰, 將熟于曲沃, 出絡, 柄有聲, 如牛. 卜低使大夫拜 曰 ; 「君命大事, 將有西師過映, 我擊之, 必大捷焉. 」 祀子自鄭使告于秦 曰 ; 「鄭人使我掌其北門之管. 若潛師以來, 國可得 也. 」 穆公訪諸寒叔 .. 迷 叔曰 ; 「勞師以製遠, 非所聞也•師勞力翊, 遠主備 之, 無乃不可平?師知所爲, 鄭必知之. 勤而無所,必有伴心. 旦行千里,其 誰不知 ? 」公辭焉. 召孟明 • 西乞 • 白乙, 使出師於東門之外. 衆叔突之, 曰 ; 「孟子, 吾見師之出而不見其入也. 」 公使謂之曰 ; 「爾何知 ? 中奇, 爾墓之木 洪矣. 」 寒叔之子與師, 突而送之, 曰 ; 「晉人 禦師必於徹 , 殺有二陵焉, 其南 陵, 夏后泉之墓也. 其北陵, 文王之所辭風雨也. 必死是間, 余收爾骨病. 」 秦師遂束. 이 글은 첫머리 두어 줄은 전( 晋) 나라 얘기인데, 바로 아무런 설 명도 없이 전(秦)나라 얘기로 옮아가고 있다. 전( 晋) 문공의 관에서 소울음 소리가 났다는 것도 황당한 얘기지만, 접쟁이는 또 그것을 듣고 앞으로의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것임울 예언하고 있다. 당(唐) 나라 한유(韓急 768~824) 가 『진학해 (進學解)』에 서 「좌씨 (左氏)는 부 과(浮誘)하다」고 말한 것 도, 화려 한 수사(修辭)와 함께 이 러 한 허 구 적인 얘기의 구성까지도 아울러 지적한 말일 것이다. 전(秦)나라에 있어서도 정(鄭)나라를 몰래 기습공격할 계획을 건숙여誌!)은 실패
를 예언하며 반대한다. 그분만이 아니라 전숙은 다음해에 신여종)나 라 군대가 정나라를 기습공 격하려 다가 발각이 나 실패하고, 되돌아 오다가 효 C f&)에서 전( 晋) 나라 군대와 싸워 패전할 것까지도 마리 알고 있다. 십지어 전숙은 종군하는 자기 아들이 효(殷) 땅의 어느 지접어 1 서 죽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통곡하고 있다. 여기에 비 하여 다음 해인 회공(僖公) 33 년 여름의 전쟁에 관하여는 「전나라 군사를효에서무찌르고,맹명·서걷·백을을 사로잡아 개선하였 다. (敗秦師于截 獲百里孟明視 • 西乞術 • 白乙丙以歸. )」고만 쓰.고 있 다. 그러 니 『좌又J』은 유교적 인 윤리 도덕 을 가르치 기 위 하여 사실 여캥t) 울 근거로 하여 꾸며진 역사소설이나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다. 어떻든 『좌전』은 이전의 어떤 중국의 문장보다도 내용이나 형식 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굳이다. 이 때문에 〈사실의 기록 〉 에 있어서는 곧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역사서 인 『사 기 (史記)』나 『한서 (漢書)』의 문장의 규법 이 되 고, 전(秦) • 한(漢) 이 후 중국 산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참고도서〉 『春秋經傳菓解』 30 卷, 朝鮮 菓賢殿 受命 撰. 『春秋 集傳 大全』 55 卷 朝鮮 弘文館 受命 撰. 『春秋四傳紹傳』 3 冊, 朝鮮 沈大允 撰. 『春秋左氏傳証譯』 韓國 李錫浩, 翰林出版社, 1976. 『春秋經傳渠解』 30 卷, 晋 杜預 撰(四部穀子|J, 四部備要本) 『春秋左傳正義』 60 卷, 晋 杜預 注, 唐 孔짧 i迷 疏(十三經注疏本) 『春秋公羊傳注疏』 28 卷, 漢 何休 注, 唐 徐彦 疏(十三經注疏本) 『春秋穀梁傳注疏』 20 卷, 晋 范寧 注, 店 楊士勘 疏(十三經注疏本) 『春秋渠解』 12 卷, 宋 蘇徹 撰 『春秋集注』 11 卷, 宋張沿撰 『左傳附注』 5 卷, 明 陸梨撰 『左傳補注』 6 卷, t育 惡棟撰
『左傳記事本末 』 53 卷, 淸 高士奇 撰 『左傳補釋』 32 卷, 消 梁玉繩 撰 『左傳補疏』 5 卷, 淸 魚循 撰 The Ch'un Ts'ew, wi th Tso Chuen, Jam es Legg e (Chin e se Classic s Vol. 5), Rep r in t , Univ e rsit y of Hong Kong Press, Hong Kong , 1960.
2. 『국어(國語)』 『국어.!]는 『좌전』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산문이다. 이 책 둘은 바숫한 시대의 일울 기록하고 있고 ,18) 많은 같은 사람과 감은 일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 심지어는 그 기록의 표현 자구(字句)까지 도 완전히 같은 곳조차 있어 , 옛날에는 『국어.!]도 『좌전.!]과 함께 좌 구명(左丘明)이 지었고 조 같은 책 하나를 가지고 뒤에 이 두 가지 책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 그래서 옛날에는 『국어.!]를 『외전(外傳)』, 『좌전.!]을 『내전(內傳)』이라 부르 기도 하였다.
18) 『國語』는 西周 穆王 2 年 (B.C.990) 의 일로부터 東周 定王 16 年 (B.C .4 53) 에 晋卿 智伯이 被殺되는 일에 이르는 538 年 사이의 일을 記錄하고 있어, 『左傳』보단 그 時代가 넓은 셈이다.
19) 近來엔 康有爲 『新學僞經考』, 扇平 『古學考』, 崔適 『史記探源』, 錢玄同 『春秋與 孔子』 등에서 同_人의 作品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의 내용은 비슷한 곳보다도 서로 다른 곳이 휠싼 더 많다. 우선 『국어』는 『좌전.!]처럼 노(魯)나라의 역사를 중십으로 한 편년체 (編年體)의 기 목이 아니 고 주어 (周語) • 노어 (魯語) • 제 어 (齊語) • 전어 (晉語) • 정어 (鄭語) • 초어 여문語) • 오어 (吳語) • 월어 @섭語) 등 나라벨로 사건의 기록이 엮어져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각 나 라의 역사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몇가지 서로 연관도 없 는 사전까지도 되는대로 모아놓은 성질의 것이다• 예를들면 〈노어〉 는 장문중(滅文仲) • 이 혁 (里革) • 공보문백 (公父文伯)의 사적 이 중십을 이루고 있고, 〈제어〉는 환공(桓公)의 재상 노릇을 한 관중(管仲)의 정적 (政續)에 대한 기술이 중십을 이루며, 가장 편폭이 간 〈전어〉는 정치를 찰하지도 못한 헌공(獻公)시대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 는데 , 태 자인 신생 (申生)의 참사와 그의 이 복(異腹)형 제 인 중이 (重 耳)의 국의 망명과 뒤에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는 경과 등의 기록이 중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래 장이인(張以仁 )20) 은 『국어』 에 기록된 240 여사(餘事) 중 대략 3 분의 1 은 『좌전』에는 없는 일들
20) 張以仁 『論國語與左傳的關係』(中央硏究院 『藍史語言硏究所菓刊』 第 33 本).
이고 3 분의 2 정도가 『 좌전 』 에도 보이나 그 내 용 은 서로 다른 것이 대부분이며, 『사기 ( 史記)』의 기록은 『좌전』을 근거로 한 것도 있고 『 국어』를 근거로 한 것도 있으며, 처작 대도도 『좌전』은 역사의 기 록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어』는 권선( 勸善) 에 치중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르니 같은 책이 둘로 나뉘어전 것일 수가 없다고 논증하 였다. 그는 뒤에 다시 21) 두 책의 문법과 용어를 비교하여 『좌전』과 『국어』가 같은 사람이 지은 굳일 수가 없음도 논증하였다.
21) 張以仁 『從文法語梨的差異證國語左傳二한非一人所作』(中央硏究院 『歷史語 言 硏究 所栗刊』 第 34 本).
『국어』의 서술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역사적 인물의 말이나 대화 또는 서로 토론하는 말들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모든 사건들을 기술해 가고 있다. 심지어 〈주어〉 • 〈노어〉 • 〈 제어 〉 같은 곳의 어떤 사건의 기록은 한 인물의 일장 열변을 빌어 처자의 정치론을 펴고 있어서, 그 사실의 기록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끌어낸 핑계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있다. 보기로 『국어』 첫머리 〈 주어 〉 를 보면 목왕(穆王)이 견융(犬戌)을 정벌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채공(祭公)의 간언(諒言)을 동하여 치도(治 道 )를 개전(開 陳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뒤로는 밀(密)땅 세 딸의 어머니말, 소 공(郡公)의 여 왕(腦王)에 대 한 간언, 예 양부(丙良夫)의 간언, 괵 문공 ( 銀 文公)의 선왕( 宣 王)에 대 한 간언, 중산보(仲山父)의 간언 동을 통 하여 치 도(治道)와 윤리 (倫理)등을 논한 말들이 중십 을 이 루는 기 록 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 내용은 사람들의 〈말( 語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기록은 여러 〈 나라(國)〉 벌로 나뉘어 져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이 『국어』라 붙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국어 』는 『좌전』과 비 슷한 춘추( 春 秋 ) 무렵 의 이 야기 와 전설울 기 록한 것이지만, 『좌전』은 역사적인 일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치도 (治 道 )와 윤리에 대한 설교는 속에 감춰 두고 있는데 비하여 『국어』 논 설교를 겉에 드러내어 역사적인 일의 기록은 설교를 하기 위한 구실인듯이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국어』의 각 대목에 있어서 거 기에 기록된 사건들과 어떤 사람의 입을 빌어 늘어놓고있는설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지 않아, 『좌전』에 비하여 훨싼 이것은 역사
를 기록한 책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다만 한 대목의 기록 속에는 십한 비약이나 생략이 없이 시종 연결이 잘 되고 있으나, 변화가 없고 밋밋하여 『좌전』과 같은 생동하고 핍전(運低)하는 힘을 느끼기 가 어렵다. 그러나 『좌전』 보다는 무리가 없고 읽기 쉬운 곳이 많 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굳이 씌어전 시대가 약간 뒤전 때 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어』에는 『좌전』보다도 간 논설을 전개하고 있는 굳이 많고, 그 간 논설문만을 놓고 본다면 『국어』 쪽이 문장의 기능면에 서 볼 때 산문으로서 더 발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보기로 아래에 〈주어 > 상(上)권의 앞 부분에 서 한 대 목을 보기 로 돈다. 주(周) 여왕(腐王)이 포악하니 나타 사람들이 왕을 비난하였다. 소공 (郡公)이 「백성들이 정령(政令)을 견디지 못하고 있읍니다.」하고 아뢰이 니 , 왕은 노하여 위 (衛)나타 무당을 구하여 비 난하는 자둘을 감시 케 하고 는, 보고를 하기만 하면 곧 그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은 감 히 말도 못하고 길에서 마주쳐도 눈짓만율 하였다. 왕은 기뻐하면서 소 공에게 「나는 비난을 막아내었으니, 이젠 감히 말도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 다. 이 에 소공이 말하였다. 「이것은 말을 막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것 보다도 더한 일입니다. 강물이 막히었다 터지는 날이면 상하게 되는사람 도 반드시 많을 것인데, 백성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때문에 강물을다 스리는 사람은 불길을 터서 찰 통하게 해주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자는정사 를 처리함에 있어 공겅(公卿)으로부터 높은 관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시 (詩)를 바치 게 하고, 22) 악사(樂師)로 하여 금 악곡올 바치 게 하고, 사관 연 2 官)으로 하여 금 기 록을 바치 게 하고, 사(師)는 교훈을 하도록 하고, 악 관(樂官)은 시를 읊도록 하고, 악공은 교훈을 의도록 하며, 여러 공인(工 人)들은 기술적인 일을 아뢰도록 하고, 낮은 백성둘은 의견율관리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은 여러가지 규칙에 대하여 아뢰도 록 하고, 친척들은 정치를 살피어 찰뭇울 고치도록 아뢰게 하며, 악사와 22) 獻詩는 노래의 가사인 詩을 동하여 政治의 待失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앞 『詩經』 참조 바람.
사판둘이 가르쳐 주고 깨우쳐 수고, 스승 같은 이듈이 행실을 닦아 수도 록하며, 그러한 뒤에 임금이 저절히 행동하는 것이니, 그러면 일이 제대 로 행하여져 어굿나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에개 입이 있는 것은 마치 땅 에 산과 냇물이 있는 거나 같은 것이어서 재물과 쓸 물건이 여기에서 나 오게 되며, 마치 들판과 늪에 넓 은 땅과 도랑이 있는 것이나 같아서 먹고 입을 것이 여기에서 나게 됩니다. 입은 말을 퍼드리는것이어서 훌륭하고 그릇된 것이 여기에서 경정되는 것이니, 훌륭하다는 것은 행하고, 그 릇 된 것에는 대바를 하게 되는데, 재물과 쓰는 것과 입고 먹는 것을 풍부히 하는 근거가 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으 로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데 어찌 막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들의 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얻마 동안이나 갈 수가 있겠읍니까?」 왕은 들어 주지 않아, 이에 나라에는 감히 말을 하는 이가 없게 되었었 는데 삼년 만에 왕은 채 (~) 땅으로 유배 (流配)를 당하게 되 었 었 다. 腐王虐, 國人誘王. 召防公告曰 ; 「民不塔命矣• 」 王怒, 得衛巫, 使監諦者, 以告則殺之. 國人莫政言, 道路以目. 王喜, 告郡公曰 ; 「吾能酉 諦矣 . 乃不 政言.」 召[公曰 ; 「是障之也. 防民之口, 莊於防J II. 川壅而浪, 傷人必多, 民亦如 之 是故爲川者決之使導, 爲民者宣之使言. 故天子聽政,使公卿至於列士獻 詩, 뽑獻曲, 史獻 書 , 師策,陵賊, 暖踊, 百工諒, 庶人傳語, 近臣盡規,親 威補察, 뽑史敎海, 耆文修之, 而後王勘苗焉. 是以車行而不悼. 民之有口, 猶土之有山川也, 財用於是平出, 猶其原隔之有衍沃也, 衣食於是平生. 口之 宣言也, 善敗於是平興, 行善而備敗, 其所以阜財用衣食者也. 夫民慮之於 心, 而宣之於口, 成而行之, 胡可壅也?若壅其口, 其與能幾何?」 王不聽, 於是國莫放出言, 三年乃流王於裁. 『국어』의 논설들은 길이가 길 뿐만이 아니라 논리의 전개에 반 듬이 없다. 이것온 [j'좌즈J』보다도 휠싼 발달한 산문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j'좌六J』에는 이처럼 간 논설문이 극히 드물었던 데 비하여, [j'국어』에서는 오히려 이런 논설문이 가 대목의 중십을 이 루고 있다. 이 것은 전국 말엽 의 제 자(諸子)들의 글과도 연결시 켜 문장의 발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좌전』보다는 한자의 문 자로서의 표현기능이 한 단계 발전하였던 시대의 작품인듯 하다.
논설분만이 아니라 대화나 서술문장도 사건이나 뜻의 표현 면에 있어서는 『좌전』보다도 발달한 면모를 느끼게 한다• 특히 〈전어 (晋語)〉 앞머리에 보이는 진 헌공(歐公)시대의 이희 ( 縱姬 )2” 를 중십으 로 하는 궁전 안의 음모와 태자인 신생(申生)의 죽음, 그의 이복 형 제인 중이 (直 耳)의 망명과 두1 에 다시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는 경과 둥은, 그 중 일부분의 얘기가 『 좌 7山 』에도 실려 있지만 『국어』의 문 장은 훨씬 서술이 자세하고 국적(劇的)인 효과를 느끼게 한다. 『좌 전』처럼 힘있고 간결한 느낌은 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 서술의 빈듬 없는 짜임새와 정확한 그 때 상황의 묘사는 문장의 완곡한 아름다 움을 느끼 게 한다. 보기 로 이 희 가 우시 (俊施)라는 배 우(俳區)와 걷 탁하여 태자인 신생을 재거하는 음모를 진행시키면서, 일단 일이 공개되었을 때 대부(大夫)인 이극(里克)이 어느 편을 가담할까 알아 보는 대목을 읽어 보기로 하자.
23) 廢姬 一쁩 獻公이 隅戌운 征伐하고 잡아온 女子로, 뒤에 獻公의 龍愛문 받고 笑 齊룹 낳아 太子 申生울 없애고 자기 아들을 太子로 삼으려 陰謀문 다 하 였다 .
이회가 우시에게 말하였다. 「입금께서 이미 내게 태자를 죽이고서 해제 (吳齊)믈 세울 것을 허락하셨으나, 나는 이극(里克)이 거리끼는데 어찌하 면 좋 을까?」 우시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국을 따르게 하는 것은 하루 일꺼리에 불 과합니다. 마님께선 처를 위해 양 한마리를 잡아 음식을 마련해 주시면 저는 그외 ·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겠읍니다. 처는 배우라서 말에 허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희는 허락을 하고 곧 음식을 갖추도록 하여 우시로 하여금 이극에게 가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술을 마시다가 우시가 일어나 춤을 추 ·면 서 이 국의 처에게 말하였다. 「마님께옵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셨으니, 처는 영 감님으로 하여금 여유있고 즐겁게 임금을 성기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는 노레를 불렀다. 「여유있고 즐겁게 섬기려 하면서도 친근해지진 못하니, 지혜가 새나 까마귀만도 못하네. 남은 모두 무성한 나무에 모여드는데,
자기만 홀로 고목에 앉네.」 이국이 옷으면서 묻었다. 「어떤 것이 무성한 나무이고, 어떤 것이 고목 인가?」 우시가 대답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부인(夫人)이 되고, 그 아들은 임 금이 된다면 무성한 나무라 해서 안되겠읍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죽 었고, 그 아들은 또 비방울 받고 있다면 고목이라 해서 안되겠읍니까? 말라가고 또 상처까지 입고 있는 것이지요.」 우시가 나온 뒤 이극은 차란 것을 치우고 식사는 하지 않은 채 참을잤 다. 그리고 방중에 우시물 불러 말하였다. 「전에 그대 말은장난인가, 그 렁지 않으면 둘은 바가 있는가?」 「예, 임금님께서 이미 이회에게 대자를 죽이고 해제를 대신 세울 것을 허락하셨으니, 계책은 이미 이루어전 것입니다.」 이국이 말하었다. 「나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태자를 죽이는 것이라해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또한 오랜 동안 사귀어 온 처지이니 나로서는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중립을 지킨다면 화를 면하게 될까?」 우시가 말하였다. 「면하게 되시지요.」 應姬告儀施曰 ; 「君親許我殺太子而立矣齊矣, 吾難里克, 奈何 ? 」 俊施 曰 ; 「吾來里克, 一日而已. 子爲我具特羊之菜, 吾以從之飮酒. 我俊也, 言 無郵.」 園姬許諾, 乃具, 使俊施飮里克酒. 中飮, 俊施起舞, 謂里克妻曰 ; 「主孟哈我, 我敎炫假豫事君. 」 乃歌曰 ; 「假豫之吾吾, 不如鳥烏. 人皆集於 苑, 己獨集於柏.」 里克笑曰 ; 「何謂苑?何謂柏?」 俊施曰 ; 「其母爲夫人, 其子爲君, 可不謂苑平 ? 其母槪死, 其子又有諦, 可不謂柏平 ? 柏旦有傷. 」 優施出, 里克辭食, 不倭而度. 夜半, 召俊施曰 ; 「旋而言戱平 ? 柳有所聞之 平 ? 」 曰 ; 「然, 君紙許關姬殺太子而立笑齊, 謀槪成矣. 」 里克曰 ; 「吾秉君 以殺太子, 吾不忍, 通復故交, 吾不政, 中立其免平?」 優施曰 ; r~ ! 」(晋 語二) 다시 한 대목 건너 태자인 신생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대목을 더 읽어 보자. 이회가 임금의 명에 따라 신생에게 명하였다. 「지난 처녁에 임금님께서 제 강(齊姜 )24) 의 꿈을 꾸셨으니 , 꼭 속히 제 사를 지 내 고 계 육(祭肉)을 보 24) 齊姜 : 申生의 어머니.
내오도록 하십시오.」 신생 은 응낙율 하고 곧 곡욱(曲沃)에 가서 제 사를 지 내 고서 궁전으로 제육을 가져 왔다. 임금은 사냥을 나갔었는데, 이회는 제육을 받자 곧 침 독(i街類)을 술에 넣 고 근독( 范 毒)을 고기 에 묻혀 놓았다. 임 금이 돌아와 신생에게 제육을 가져 오도록 하였는데, 임금이 그것으로. 고수례를 하자 땅이 부풀어 오르니, 신생온 두려워서 나가버렸다. 이회가 그것을개에게 주자 개가 죽어버리고, 낮은 신하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도 역시 죽어 버 렀 다. 임 금이 명 을 내 려 두원관(杜原軟 )25) 을 죽이 도록 하자 신생 은 신 성 (新城 )26) 으로 도망하였 다. 두원관은 죽기 에 임 박하여 태 자의 낮은 산하 어 (團)를 통하여 산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처는 재주도 없는데다 지혜 도 없고 불민하여, 제대로 교도를 못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임 금님의 마음 쓰임도 깊이 알지 못했었읍니다.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넓은 땅을 찾아 숨으시려 하시나 처의 작은· 마음은 고집이 있어 감히 따라 도 망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말이 들려도 변명할 곳이 없었으니. 그래서 큰 환난에 빠지게 되고 곧 참해(臨害)를 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죽음을 꺼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칙 참해하는 사람 과 똑같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전대 군자는 진정을 버리지 아니하 고 참언(魏 言 )을 반박하지 않는다 했읍니다. 참언이 주효하여 자신이 죽 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니 그래도 훌륭하다는 명성은 남게 되기 때문입 니다. 죽어도 전정을 바꾸지 않는 것은 강한 것이며. 전정을 지킵으로써 아버지름 기쁘게 하는것은 효도이며, 자신을 죽이면서도 뜻을 이루는 것 은 어진 것(仁)이며, 죽음에 있어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온 공경스러움 (敬)인 것입니다. 젊은· 당신은 이에 힘쓰십시오. 죽어도 반드시 사랑을 남기고 백성을 위해 죽는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괜찮지 않겠읍니까?」
25) 杜原~ : 申生의 師傳
26) 新城 : 曲沃에 있논 太子의 城 이름.
산생은 이에 호응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신생에게 말하였다. 「태 자님의 죄가 아닌데 어찌하여 도망치지 않습니까?」 신생이 말하였다. 「안되오 ! 도망을 쳐서 죄에서 풀려난다면 그것은 반 드시 임금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임금을 원망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죄악을 밝히는 것은 제후들의 바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오. 내 어 느 고장으로 도망쳐 들어 가겠소 ? 안으로 부모에 게 곤욕윤 치 르고 밖으로 제후들에게도 곤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곤욕이 거둡되는 것이오. 입금을
버리고 죄에서 도망치려는 것온 죽음에서 도망치는 짓아오. 내가 듣건 대, 어진 사람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지해있는 사람은 거듭 곤욕을 치르지 아니하고 용기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도망치지 않는다 했소. 만약 죄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면 도망을 치면 만드시 머 무거워질 것이오. 도망을 처 서 죄믈 무겁게 하는 것은 지해로운 일이 못되며 죽음에서 도망치며 임금 을 원망하는 것은 어전 짓이 못되며, 죄가 있는데도 죽지 않으려는 것은 용기가 없는 짓이오. 도망윤 치면 원한이 두터위질 것이니, 악은 거듭해 서는 안되고 죽음은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오. 나는 엎드려 명운 기다리 겠소.」 이회는 신생을 만나자 통곡을 하면서 말하였다. 「아비가 있는데 차마 그런 짓을 하려 하였으니, 하물며 나라 사람들이야 어떠하겠움니까? 아 비에게 차마 그런 짓울 하며 사람들이 좋아하기를 바란다해도 어떤 사람 이 그를 좋아하겠읍니까? 아비를 죽아면서 사람돌이 이롭게 해 주기룹 바란다 해도 어떤 사람이 그를 이롭게 해 주겠읍니까?모두 백성들이 미 위할 일이니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희가 물러가자 신생은 곧 신성의 묘당에서 사형을 당한다. 應姬以君命命申生曰 ; 「今夕君夢齊姜, 必速祠而歸福. 」 申生許諾, 乃祭于 曲沃 歸福于絡. 公田, 際姬受福, 乃箕鷄于酒, 宜單于肉. 公至, 召 申生 戱 公祭之地, 地慣, 申生恐而出. 腦姬與犬肉 , 犬堯 ; 飮小臣酒, 亦少흠. 公 命殺杜原欲,申生拜新城. 杜原軟將死, 使小臣菌, 告于申生曰 ; 「欽也不才, 森智不敏, 不能敎導,以至于死, 不能 深知君 之心度. 棄而, 求廣土而政伏 焉 , 小心猶介, 不耿行也. 是以言至而無所松之也, 故路於大t1t, 乃速于~. 然欲也不政愛死, 唯與臨人鈴是惡也. 吾聞君子不去情, 不反f&l.MiJ行身死可 也, 猶有令名焉. 死不遷情, 强也;守情說父, 孝也;殺身以成志,仁也;死 不忘君, 敬也. 孫子勉之!死必追愛, 死民之思, 不亦可平?」申生許諾.人 謂申生曰 ; 「非子之罪, 何不去平?」 申生曰 : 「不可, 去而罪釋, 必歸於君, 是怨君也.章父之惡, 取笑諸侯. 吾誰鄕而入?內困於父母, 外困於諸侯,是 重困也. 棄君去罪, 是逃死也. 吾聞之, 仁不怨君, 智不重困, 勇不逃死.若 罪不釋, 去而必度. 去而罪重, 不智 ; 逃死而怨君, 不仁 ; 有罪不死, 無勇. 去而厚怨, 惡不可直, 死不可避. 吾將伏以侯命. 」 園姬見申生而突之, 曰 ; 「有父忍之, 況國人平 ? 忍父而求好人, 人執好之 ? 殺父以求利人, 人執利之 ? 皆民之所惡也, 難以長生. 」 騎姬退, 申生乃維經于新城之廟. (晋語二)
이상의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국어』의 문장은 사건의 서술에 빈 듬이 없고 묘사가 찬찬한 소설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두원관 (杜原狀)이 나 신생 의 입 을 통한 충(忠)에 관한 논설도 『좌전』의 건 논설문처럼 수사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뜻의 전달을 위한 논리의 구성 에 두드러 전 발전을 보여 주고 있 다. 이 뒤 로는 다시 공자(公子) 중이(道耳)가 이회의 모항을 못 견디어 국의로 도망쳤다 뒤에 귀국 하여 문공(文公)으로 즉위하기까지의 파란많은 곡철이 길게 이어전 다. 이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소설로 보는 편이 훨씬 옳을 것이다. 어떻든 중국 고대의 산문은 『 국어』에 이르러 한 단계 더욱 발전 하고 있다. 『좌전』이 보여준 강동적인 표현과 『국어』에서 더욱 발 전한 소설적인 수법은 후세 중국 서사문(敍事文)의 규범이 되었다. 특히 후세 의 사서 (史書)들은 여 기 에 서 사건과 인물의 생 동하는 표현 기법과 희극적(戱劇的)인 구성의 수법을 다분히 계승하였다. 〈참고도서〉 『國語 韋 氏解』 21 卷, 吳 韋昭 撰. 『國語校注本三種』 29 卷, 淸 江遠孫 撰. 『國語正義』 21 卷, 淸 董增齡 撰. 『國語韋昭注疏』 16 卷, 淸 洪亮吉 撰.
3. 『전국책 (戰國 策 )』 『전국책』에는 동주( 東周 ) 정왕(定王) 16 년 (B.C.453) 으로부터 전시 황( 秦 始 皇) 이 천하를 통일하기까지에 이르는 전국시대의 일들이 기 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동주( 束 周) • 서주(西 周 ) • 전( 秦 ) • 제 (齊) • 초 여분 ) • 조(趙) • 위 ( 魏) • 한( 韓 ) • 연( 燕 ) • 송(宋) • 위 ( 衛 ) • 중 산(中山)의 12 국벌로 나뉘어 편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분량은 이른바 전국철웅( 戰國 七 雄 )인 진 • 제 • 초 • 조 • 위 • 한 • 연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각 나라의 기록은 연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때 누가 쓴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 내용으로 보아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은 철대로 아니다. 본시 이 책 은 『국책 (國策)』 • Ii'국사( 國事 )』 • 『단장( 短長 )』 • Ii'사어 (事語 )』 • Ii'장서 (長 書 )』 • Ii'수서 ( 修書 )』 27) 둥 여 러 가지 로 불리 웠는데 , 한( 漢 )대 에 유 향(劉向, B.C.77~B.C.6) 이 이 를 정 리 하여 『전국책 』이 란 이 름을 확정 시켰다. 이 책은 지금도 판본頃혀:)에 따라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 는데, 이는 옛부터 이 책이 전해지는 사이에 후세 사람들에 의한 많은 개편과 개정 둥이 가하여졌음을 뜻한다. 본시 이 책에 기록된 일들이 한 나라분만 아니타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 및 여러 가지 사 건과 관련된 것이 많으므로, 이를 나라벌 또는 시대별로 정리하는 데 있어 각기 자기네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여 혼란이 없을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판본은 그 체제는 말 할 것도 없고 문장에 이르기까지도 한대 유향의 손질이 가장 많이 가해전 것임에 몰림없다.
27 ) 『戰國策』 劉向 序文 依操.
『좌조J』과 『국어』는 그 내용이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의 얘기를 빌어 윤리 도덕을 설교하는 성질의 것이었지만, Ii'전국체』은 어지러 운 전국시대의 정치가나 유사(游士) 표식사(策士)둘의 상대방울 쓰러 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책략(策略)에 관한 얘기가 중십을
이루고 있다. 『전국책』도 전국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을 구실로 삼고 있지만, 업겨한 뜻에서의 역사와는 『좌전』이나 『국어』 보다도 더욱 멀어져 있다. 그분만이 아니라전국시대에 와서는 춘추 시대에는 정치상의 구십접(求心點)이 되어 왔던 천자(天子)의 주@]) 나라 왕실도 완전히 권위를 잃은 채 여러 나라들이 약육강석(弱肉强 食)을 일삼던 때라서 『좌전』고} 『국어』에서 강조되던 윤리 도덕도 『전국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의 추 구를 위하여는 온갖 수단과 음모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전국칠웅 (戰國七雄) 중에서도 한(韓) • 위(魏) • 조(趙)는 전(晋)나라가 셋으로 갈라져 이루어진 것이라국세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동북쪽에 치우 쳐 있던 연(燕)나라도 힘이 없어 이들은 패권을 다투는 싸움에 정식 으로 끼어들지는 못하였다. 이 때 정석으로 천하 통일을 노리며 싸 웠던것은 서쪽의 진(秦)나라와동북쪽의 제(齊)나라와 남쪽의 초(楚) 나라였다. 개인분만이 아니라 이들 나라도 화약(和約)과 전쟁을 자 기 나라의 편의 대 로 활용하였고, 작은 나라들은 의적 (外敵)을 막기 에 여념이 없고 큰 나라들은 자기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책략 C 策略)을 다하던 시대이다. 그 중에도 나머지 여섯 나라를 연합시켜 강한 전나라에 대 항시 키 려 는 술책 을 추전하여 육국(六園)의 상인(相 印)울 한 몸에 찼던 소전(蘇秦)의 합종책 (合縱策)과 이 여 러 나라들 로 하여금 전나라와 화약(和約)을 맺게 하여 전나라가 원교근공책 (遠交近攻策)을 써서 천하를 통일하는 기를울 마련토록했던 장의(張 儀)의 연횡책(連橫策)이 가장 유명하다. 여기에서 종횡가(從橫家)란 말이 나왔고, 『전국책 』은 동서 여 러 나라를 돌아다니 며 온갖 책 략 을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소전 • 장의의 얘기를 비롯하여, 이에 따론 여러 정치적 군사적 인물들의 책모(策謀)에 관한 얘기가 중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얘기의 홍미전전한 내용들은 모두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史實)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 수가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보기를 들면 『전국책』에 기록된 여러가지 사건들 은 거기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의 사전의 예측이나 예언대로 진행되 고 있는데. 그들의 예측이나 예언은 대부분이 합리적(合理的)인듯 하면서도 여러가지 꼭 그렇게만 될 수 없는 우연의 일치가 있어야
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문장에 있어서는 『좌조J 』이나 『국어』보다는 후세에 이 루어전 것이어서 어떤 얘기의 서술기능이나 수사( 修辭)에 있어서는 월동 발전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더욱 허구적 ( 虛構的 )인 데다가 형석적 인 윤리 기준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 가의 재치가 퍽 자유로이 발휘되고 있다. 『전국책』은 ii' 한비자(韓 ~1 , 子)』와 비 슷한 숟수(i舒敷)에 관한 얘 기 가 많고 문장도 거 의 비 슷한 거침없는 기세와 표현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씌어진 시대가 비슷 하기 때 문인듯 하다. 중국문장은 『전국책 』이 나온 무렵 에 야 분명 하 고 매끄러운 표현기능과 성운( 磐韻 )의 변화와 조화을 통하 여 이 부 어 지는 아름다운 어귀 둥 독특한 서술기능 및 수사기교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전국책』은 『좌전』이나 『 국어 』보 다도 월등한 얘기의 재미와 표현의 기지(機智)와 문장의 아름다 움을 맛보게 한 다. 『전국책』이 지난 날의 예의와 도덕을 무시하고 목적을 위해서 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떤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행 하는 인물들의 얘기인데도 중국에 널리 읽혀 온 것은 이것이 인정 (人情)과 사제 (事勢)의 일면을 찰 표현했을 분만이 아니 라 이 상과 같은 문장상의 목칭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책』의 첫 머리 한 대목만 읽어 보아도 그 목칭은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다. 진( 秦 )나라가 군사를 일으키어 주(周)나라를 위협하며 구정 (九 !l!)28) 을 요구하였다. 주나타 임금이 이 를 걱정하여 안승@配率)에개 의논하였다. 안솔이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동족으로 가서 재 ( 齊)나라에 구 원을 요청 하겠읍니 다. 」 안송은 제나라로 가서 계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진나라는 무도하기 짝이 없으니, 군사불 일으키어 주나타를 위협하며 구정 울 요구하고 있읍니 다. 주나라의 임 금과 신하들은 안으로 계 책 을 다 28) 九 HPr : XI 禹가 鑄造한 아홉개의 숭 商나라를 거쳐 周나라에까지 전해진 傳國之 寶입. 귀에 秦나라에까지 停해졌다가 없어졌음.
강구하여 보았는데, 전나라에 내주는 것보나는 대국 ( 재나라 ) 에 바치는 게 좋겠다는 걷론입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촌속케 하는 것은 미명(美名) 이며, 구정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보배가 됩니다 .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이에 대처해 주십시오.」 제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5 만의 군사를 내어 전신사(陳臣思)를 대장 으로 상아 주나라를 구원케 하였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군사를거두었다. 제나라가 구정을 요구하게 되자 주나라 임금은 또 이를근십하였다. 안 솔이 말하였다. 「대왕꺼 1 선 걱정마십시오. 신이 동쪽으로 가서 이를 해결하겠읍니다.」 안솔이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주나타는 대국의 의로웅에 힘입어 임금과 신하와 아비와 자식들이 보. 전될 수가 있었읍니다. 구정을 바치고자 하는데, 대국에서는 어떤 길을 좇아서 그것 을 계 나라로 가져 오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겠읍니 다. 」 제나라 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양(梁)나라에 길을 빌릴까 하오.」 안솔이 말하였다. 「안됩 니 다. 양나타의 임 금과 신하들은 구정 을 얻고자 하여 휘 대 (郞臺) 아태와 소해(少海)가에서 모의를 해온 지 오래 되었읍니다. 구정이 양나 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나라 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그럼 초(楚)나라에 길을 빌리 도록 하지 요. 」 「안됩니다.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구정을 얻고자 하여 섭정(葉庭) 안에서 모의를 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읍니다. 만약 초나라로 들어가기만 하떤 구정은 반드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대체 어떤 길을이용하여 그것을제나라로가져와야하는거요?」 안솔이 말하였다. 「저의 고장에서는 이미 속으로 대왕을 위하여 그것을 걱정해 왔읍니다. 구정이란 것은 초병이나 장항아리와는 달라서 옆에 끼거나 들고서 계나 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가 모여들고 까마귀가 날고 토끼가 뛰고 말이 달리 돗 간단히 재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 날 주나라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구정을 얻었을 때, 한 솔을 구만명 이 끌어 왔었으니 구구는 팔십 일이 라 팔십 일만명 이 끌었읍니 다. 사졸(士
卒)과 사람들 및 기계와 연모들윤 다 갖추 고 있어야만 이것을 웅직일 수 가 있읍니다. 지금 대왕께 비록 그만한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길을 이용하여 내오겠읍니까? 신은 속으로 대왕을 위하여 그 일이 겨정이 됩 니다.」 제나라 왕이 말하였다. 「선생은 여러번 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주지는 않았소.」 안솔이 말하였다. 「감히 대국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속히 가져오실 길을 정하시기만 하 며논 처의 고장에서는 구정을 그 쪽으로 옮겨 놓고 명을기다리도록 하겠 읍니다.」 재 나라 왕은 결국 그만두었다. 秦興師臨周, 而求九鼎. 周君患之, 以告顔率 • 顔率曰 ; 「大王勿湜, 臣請 東借救於齊. 」 顔率至齊 , 謂齊王曰 ; 「夫秦之爲無道也, 欲興兵臨周, 而求 九鼎. 周之君臣內 自盡計, 與秦不若歸之大國 . 夫存危國, 美名也 ; 得九 m i, 厚쨌也. 願大王回之. 」 齊王大稅, 發師五萬人, 使陳臣思將以救周, 而秦兵 龍 齊將求九鼎, 周君又患之. 顔率曰 ; 「大王勿꽃, 臣請東解之. 」 顔率至齊, 謂齊王曰 ; 「周類大國之義, 得君臣父子相保也. 願獻九鼎, 不識大國何塗之 從而致之齊.」 齊王曰 ; 「霧人將寄經於梁.」 顔率曰 ; 「不可. 夫梁之君臣, 欲 得九鼎, 謀之陣蓬之下 , 少海之上, 其日久矣. 鼎入梁, 必不出.」 齊王曰 ; 「森人將寄經於楚. 」 對曰 ; 「不可, 楚之君臣, 欲得九鼎, 謀之於葉庭之中, 其日久矣. 若入楚, 鼎必不出.」 王曰 ; 「腐人終何塗之從而致之齊?」 顔率 曰 ; 「郭邑固窟爲大王患之. 夫鼎者, 非效臨壅替표耳, 可懷扶提擊以至齊者, 非鳥飛兎興馬速, 湘然止於齊者. 昔周之伐殷得九鼎, 凡一鼎而九萬人軌之, 九九八十一萬人. 士卒師徒, 器械被具, 所以備者稱此. 今大王縱有其人,何 塗之從而出 ? 臣窟爲大王私꾹之. 」 齊王曰 ; 「子之數來者, 猶無與耳 . 」 顔率 曰 ; 「不政數大國 疾定所從出, 幣邑遷鼎以待命. 」 齊王乃止. (東周策) 이상의 글을 읽어 보면 우선 얘기의 기술(記述)이 매우완정(完整) 하고, 문장도 거침없고 매끄러우며 내용도 재미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나라 천자를 제후들이 위협하며 국권(國權)을 상칭하 는 구정을 맷으려 하고 있고, 주나라에서도 구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과 술책을 아무 거리낌없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 온 마치 재미있는 소설의 한 토막 같기도 하다. 다음에는 궁정 안 에서 일어났던 악탈한 계책에 관한 얘기를 보기로 한 대목 더 둘기 로한다. 위(魏)나라 왕이 초나라 왕에게 미인울 보내주었는데, 초나라 왕이 그 를 좋 아하였다. 부인 정수(鄭裂)는 왕이 새 사람을 좋아함을 알고서, 새 사람을 매 우 사탕하여 옷가지 와 쓰는 물건은 그가 좋아하는 것 을 골라 만 들어 주고 궁실과 침구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가리어 마련해 주는 등 .::z. 몰 사랑합이 왕보다 더 한 돗이 하였다. 왕이 말하였 다. 「부인들이 남편을 성기게 되는 까닭은 미색( 美色 ) 때문이고, 질두를하 는 것은 그들의 정이다. 지금 정수는 과인이 새 사람을 좋아함을 알고서 그를 사랑해 중이 과인보다도 더하다. 이는 효자가 어버이를 섭기는방법 이며 충신이 입금을 섭기는 방법이다.」 정수는 왕이 자기가 두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김을 알고 나서 새 사 람에게 말하였다. 「왕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있소. 그러나 그대의 코는 싫어하 고 있으니 그대는 왕을 만나거든 반드시 그대의 코를 가리도록 하시오.」 새 사람은 왕을 만나게 되면 이리하여 그의 코를 가리게 되었다. 그러 자 왕이 정수에게 말하였다. 「새 사람은 과인을 만나기만 하면 곧 그의 코를 가리는데 왜 그러는가 요?」 정수가 말하였다. 「저는 알고 있읍니다만.」 「나쁜 얘기라 하더라도 꼭 말해 주시오.」 「그는 임금님의 냄새를 맡기 싫어하고 있는 듯하운니다.」 왕이 말하였다. 「발칙하도다. 영을 내려 그의 코를 베도록 하되, 명을 거스리논 일이 없도록 하라!」 魏王造楚王美人, 楚王說之. 夫人鄭襄知王之說新人也, 莊愛新人,衣服~ 好, 擇其所喜而爲之, 宮室臥具, 擇其所善而爲之, 愛之其於王. 王曰 ; 「婦 人所以事夫者, 色也;而拓者, 其情也. 今鄭裏知森人之說新人也,其愛之莊
於其人, 此孝子之所以 갑]:親 , 忠臣之所以事君也. 」 鄭裵知王以己爲不始也, 因謂新人曰 ; 「王愛子 美矣 . 難然惡子之§;., 子爲見王則必拉子i:,\. 」 新人 見 王, 因拉其鼻. 王謂鄭襄曰 ; 「 夫新 人見 설江人 , n IJ捨 其i\ , 何也 ? 」 鄭襄 曰 ; 「妄知也.」 王曰 ; 「岡競 E , 必言之.」 鄭甄曰 ; 「其似惡聞 君王 之吳也.」 王曰 ; 「伴哉 ! 令則之, 無使逆命 ! 」(楚策四 ) 이 밖에 『전국책』에는 소전과 장의를 비롯한 유사(游士)나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자기의 의견을 아뢰는 상당히 간 논설도 여러 군데 보이 는데 , 모두 『좌전』이 나 『국어 』보다도 논리 에 반듬이 없고 문장이 아름다우면서 도 매 끄럽 다. 이 는 전국시 대 제 자(諸子 )들 에 의 하여 중국 문장의 논설 기능이 크게 발전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보기로 〈 전책(秦策) 2 〉를 보면, 전나라 선태후(宣太后)는 평 소에 우1 추부(魏 酸夫) 와 사통을 하고 지 낸다. 그러 다 대 후가 병 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태후는 「나를 장사지넬 때엔 꼭 위추자도 순장(如?葬)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한다. 횡 사를 당하게 된 위 추 자가 몹시 근심울 하고 있자 그의 찬구가 그를 구해 주려고 나선 다. 그 친구는 우선 태후를 뵙고서 「죽은 사람은 지각이 있겠읍니 까?」 물어 「지각이 없을 것」이라는 대후의 대답을 둘은 뒤 이렇게 진언(進言)을 한다. 만약 태후의 신령께옵서 죽은 사람에겐 지각이 없음을 분명하 아신다면 무엇 때문에 공연히 살았을 적에 사랑하던 사람을 지 각없는 죽은 사람 겉 에 묻으려 하십니까? 만약 죽은 사람에게도 지각이 있다면 선왕께옵서 격노하여 오신 지 오래되었을 터이라 태후께서는 찰못을 변명하기에 겨를 이 없을 것인데, 어찌 위추부와 사사로이 통할 여유가 있게 되겠읍니까? 若太后之神靈, 明知死者之無知矣, 何以空以生所愛,葬於無知之死人哉? 若死者有知, 先王積怒之日久矣. 太后救過不照, 何假乃私魏魏夫平? 이런 빈름없는 논리에 태후도 하는 수 없이 위추부를 자기 곁에 순장하려던 뜻을 거두어 버린다. 그리고 앞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i'전국책』의 얘기들
은 인간의 정 상 cm 狀)이 나 세 상 일이 돌아가는 실상 C '.CtltJ ~)을 얘 기 하 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펴 하고 있는 대목이 많다. 되도록 독자의 이해력과 상상력에 맡검으. 로써 더욱 풍부한 함축(含 帝 )을 지니도록 하자는 뜻에서였을 것이 다. 〈 제책 ( 齊策) 3 〉올 보면 유명한 맹상군(孟쌉 君 )의 사인(舍人)이 맹상군의 부인과 간동울 한다. 뒤에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어 어떤 사람이 맹상군에게 그 사인을 죽이라고 권하지만 맹상군은 「찰 생 간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냐?」고 하면서 눈감아 주다가 일년 뒤에 위(衛)나라로 보낸다. 뒤에 위나라 임금이 천하의 군사 들을 모아 제(齊)나라를 치려 할 때 그 사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위 나라 임금의 전쟁의도를 막는다. 이 대목에서 끝머리에 「제나라 사 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맹상군은 일을 찰 처리하였으니, 화(禍) 를 바꾸어 꽁(功)이 되게 하었다고 말하였다 . (齊人聞之曰, 孟符君可謂 善爲事矣 , 轉禍爲功.)」고 전체 얘기를 간단히 결론짓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인간에 대한 교훈을 깨닫도 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함축적인 필법은 결국 후세로 계승되어 중국문장의 한가지 특칭을 이루게 된다. 이 상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문장은 주價])나타 말엽 『전국책 』 에 이르러 30) 유창한 세련미와 엄정하고 빈몸없는 표현 능력과 여유 있는 문장의 구성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산문은 여 기에서 안정된 확호한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이것은 한자의 자체 (字體)의 안정과도 거의 시기를 같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도서〉 『戰國策注』 33 卷, 浚 高誘 撰(淸 黃丕烈 重校 『~J/11 姚氏本戰國策』). 『範氏戰國策注』 10 卷, 宋 抱彩 撰 . 『戰國策校注』 10 卷, 元 吳師道 撰. 30) 『荀子』, 『韓非子 』, 『呂氏春秋.I]등도 이 무렵에 이루어진 책으로. 비슷한 水準의 文효이라할수 있다 .
2. 〈立言〉의 글 〈입언〉이란 본시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뜻하는데 ,31) 대체로 사상적인 기록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여 기에서는 이론바 〈제자백가〉들의 글을 가리킨다. 법가(法家)는 정 (鄭)나라 자산(子産 )3” 에게서 비롯되었고, 병가 G 궂家)는 제(齊)나라 손무(孫武 )33) 에게서 시작되 었고, 유가(儒家)는 노(魯)나라 공구(孔丘) 에게서 바롯되었고, 묵가(墨家)는 송(宋)나라 묵적(墨稷 )34) 에게서 시 작되었고, 도가여i家)는 초(楚)나라 노담(老軒)에게서 시작되었다 하 니, 중요한 제자(諸子)의 유파는 이미 춘추시대에 다 갖추어졌던 셈 이다. 그러나 이들 제자가 그들의 참된 면목을 발휘한 것은 전국시 대의 일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들의 이름 아래 전해지는 각 유파의 처서둘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모두 전국시 대 말엽 이후에 이들의 제자 또는 재전제자(再傳弟子)들에 의하여 이루 어전 것들이다.
31) 『左傳』 襄公 2~; 「其次有立言」, 疏; 「立 言 , 謂言得其要 , 理足可傳, 其身筑沒, 其言尙存……乃是立言也. 」
32) 子産 春秋時代 鄭나라 大夫, 이름은 公孫橋, 字가 子産. 鄭나라 簡公에서 定 公·獻公·聲公에 걸쳐 國政윤 말아 나라를 强盛케 하였고, .:z.가 죽었을 때는 孔 子도 눈물윤 휼렀다 한다 .
33) 孫武: 春秋時代 齊나라 大夫. 兵法에 뀌 어 나 吳王 闇闇의 將師로서 强한 楚 • 齊 • 晋울 무찔러 覇者가 되게 하였다 . 『孫子』 十三篇을 지 었고 戰國時代 孫昭온 그. 의 後孫으로 역시 兵法에 뛰어났었다 .
34) 墨점 : 뒤 의 Ii'墨子』節 참조 .
예언〉의 굳이란 논설문이어서 명 확 한 논리의 표현을 필요로 하 는 굳이기 때문에, 앞의 『서경』이나 〈 기사 〉 의 글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중국문장은 전국시대 말영에 이르러서야 논리의 표현 기능이 비교적 완전히 갖추어졌으므로 이것들은 거의 모두 전국시대 말엽 에 이루어진 것이타 보아도 크게 들림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 자들은 동주시 대 의 겸 병 전쟁 얘 봐t 戰 爭)으로 말미 암아 일어 난 사회 의 격변, 곧 종족제도의 파괴와 이에 따른 정치 경제의 성격 변화 둥 속에서 제각기 다른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상의 표현 방식도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유가는 정치적으로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 아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는 통치계급의 입장, 경제적으로는 종족 제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새로 생겨난 대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문장은 내용과 함께 귀족적인 형식을 아울러 중시 하게 된다. 묵가는 혼란한 사회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제력 울 확장시켜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울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문장도 내용이나 표현이 질박한 경향을 지니게 된다. 법가는 겅제 적으로는 혼란 속에 새로이 등장한 상인과 지주들의 입장, 정치적 으로는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 문에 그들의 문장은 현실적이고 논리의 명확한 표현에 치중하게 된 다. 도가는 남방의 따스한 기 후와 풍부한 물산을 배 경 으로 한 낭만 적인 기질울 대표하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를 초현실로 초국하려 하 여 그 문장도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된다. 이처럼 제자백가들은 모두 논리를 존중하면서도 제각기 다론 성 격의 문장을 썼으므로 사상문만이 아니라 문장의 여러가지 기능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중국의 고대 산문이 지닌 여 러가지 수사기교나 함축적이고도 아름다운 표현 기능 등은 모두 이 때에 갖추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성격의 제 자들이 어떻게 제각기 중국의 문장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추 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중국 문장의 톡칭을 문학사적으로 이해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제자서(諸子 書 )는 여기에서 논술하고 있는
것 이의에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 은 후세의 위탁({福t)한 굳임이 분명하거나 잡다한 성격을 지닌 것 이어서 전국시대의 산문울 대표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 면 유가의 경 전 (經傳) 중에 도 『주례 (周祖)』 • 『의 례 (儀禮)』 • 『예 기 (禮 記)』 • 『효경(孝經)』 등은 모두 한(漢)대에 이루어전 것들이고, 그 밖 에 『상자(商子)』 • 『관자(管子)』 • 『안자춘추(꽃子春秋)』 • 『열자(列子)』 • 『귀 곡자(鬼谷子)』 • 『오자(吳子)』 둥이 모두 후세 의 위 탁이 다. 그 이 외에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나, 그 문장 성격이 여기에 논술하는 책의 법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 는 것들이어서 생략하였다. 여 기 에 서 『논어 (論語)』 • 『맹 자(孟子)』 • 『묵자(墨子)』는 전국시 대 산문의 기반을 이루는 성격의 것들이라 생각되어 앞머리에, 『장자 (莊子)』는 새로운 남방의 기질울 도입하여 자극을 가함으로써 중국 문장울한층더 발전시키는계기가됐다는뜻에서 그다음에, 『순 자(荀子)』 • 『한비자(韓非子)』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천하동 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문장아란 뜻에서 다시 그 다음에 놓고, 전(秦)나라 초기의 작품이지만 여기에 『여씨춘추 (呂氏春秋)』를 끝머리에 붙여 놓은 것은 사상적으로나 문장면에 있어 서나 이상의 제자(諸子)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L 『논어 (論語)』 『논어』에는 공자의 말, 또는 공자와 그의 제자 및 그 때 사람들 과의 대화나 그들의 행동에 관한 기록들이 모아져 있다. 이 때문에 『논어』는 옛부터 공자와 유가의 사상이나 성격을 연구하고 이해하 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여겨쳐 존중되어 왔다. 특히 송(宋)대의 성 리 학자 정 이 (程臨 1033~1107) 가 『논어 』를 존숭하고 이 어 주회 (朱惡 1130~1200) 가 다 자(孟子)』 • 『대 학(大學)』 • 『중용(中庸)』과 항 께 『사서 (四古)』로 묶어 주석 을 달고 유가의 기 본 교과서 로 삼은 이 래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티 나라나 일본에 있어서까지도 공부하 는 사람이라면 꼭 읽는 필독서가 되었다. 따라서 『논어』가 동양문 화 전반에 걷쳐 끼찬 영향은 어느 책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반고(班固 32~92) 는 『한서 ( 漢검)』 예 문지 (藝文志)에 서 『논어 』란 책 이름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논어』란 것은 · 공자가 제자와 시인(時人)들에게 응답한 것과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하되 공자에게서 직접 들은 것에 관한 말(語)인 것이다. 당시 의 제자둘은 제각기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공자께서 돌아가신 뒤 문인(門人)들이 서로 모아서 논찬( 論纂 )윤 한 것이기 때문에 『논어』라 말 하는 것이다. 論語者, 孔子應答弟子時人, 及弟子相與言而接聞於夫子之語也.常時弟子 各有所記, 夫子競卒, 門人相與輯而論纂, 故謂之論語. 그에 의 하면 『논어 』란 곧 〈공자가 제 자와 시 인(時人)들과 응답한 말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논찬(論墓)한 것〉이란 뜻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뜻을 좀 더 부연한 다른 견해들도 있으나 ,35) 이 『한서』의 해석이 무난한 듯하다. 35) 漢 劉熙 『釋名』 釋典藝; 「 論 , 倫也, 有倫理也; 語, 敍也, 敍己所欲言也J 또 唐 陸德明 『經典釋文』에서 『 論語 』의 論字를 「給也, 輪也, 理也, 次也, 撰也.」라解說 한 것 등이 그 보기이다.
또 위 fj'한서 』 의 말을 보면 fj' 논어 』는 공자의 문인들이 편찬한 것 이라 하였는데, 다시 후한(後淡)의 정현( 鄭 玄, 127~200) 은 「『논어』 는 중궁(仲弓) • 자하(子夏) 등이 찬정 (撰定)한 것」 36) 이라 하였고, 양 (梁)나라 황간(皇ffi, 488~545) 은 『논어 의 소( 論語義疏) 』에 서 「『논어 』는 공자가 죽은 뒤 칠십제자(七十 弟子) 의 문인들이 함께 편찬한 것」이라 하는 둥 그 밖에도 여러 견해가 있으나 ,3 모두 어느 때 누구에 의 하여 편찬된 책인가를 분명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책 은 한때 한 사람에 의하여 편찬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대략 공자가 죽은 (B.C.479) 뒤로 100 년 이상 지난뒤에 이루어전 것으로 보인다.
36) 『經典釋文』 奴錄所引.
37 ) 唐 柳宗元온 『 論語辯 』에서 曾子의 弟子가, 淸 莘學誠은『文史通義』 詩敎 上에서 『論語』엔 曾子의 죽음에 판한 기 목이 보이 니 戰國時代에 이 루어진 것 이 라는 등의 主張윤하고 있다 .
『논어 』는 학이 (學而) • 위 정 (爲政) • 팔일 (八{유) • 이 인 (里仁) • 공야장 (公治長) • 옹야(雍也) • 술이 (述而) • 태 백 (泰伯) • 자한(子~) • 향당 (鄕 ~) • 선진(先進) • 안연(顔淵) • 자로(子路) • 현문(憲問) • 위령공( 衛었 公) • 계 씨 (季氏) • 양화(陽貨) • 마 자(微子) • 자장(子 5 長 ) • 요왈( 堯曰) 의 20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편은 한 단(段) 2·30 자 정도의 글들 (100 자가 넘는 것은 극히 드물다)이 배열되어 있는데 도합 497 단이다. 이들각편은일정한체계나순서에 따라구분된 것이 아니며, 각 단의 내용도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위에 돈 편제여첩題)도 『시경』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첫 단중에서 적 당한 글자 두세 자를 골라 정하여 책을 다루기 편하도록 한 것일 따 몸이다. 『한서 』 예 문지 (藝文志)에 는 『고논어 (古 '鮮語)』 21 편 • 『제 논어 ( 齊論 語)』 2 책 • 『노논어 (魯'鮮語)』 20 편이 처 록되 어 있 다. 『고논어 』는 한나라 경제(景帝) 때에 공자가살던 옛집을 헐다가 벼 듬에서 『고문 상서 (古文尙 첩 )』 등과 함께 발견된 것 이 다. 38) 위 (魏)나라 하안(何꽃) 의 『논어집해 (論語集解)』 서문에 의하면 요왈( 堯 El) 편의 하단(段) 「자 장문(子張問)……」 이하를 따로 데어 한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 논어』는 21 편이고, 편차도 『제논어』나 『노논어』와 같지 않았다고
38) 王充 『論衡』 正說篇 依城.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굳자도 이들과서로 다론개 400 여자나되었다 한다 .39) 『제논어』는 제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판본으로 『노논어.!l나 『고논어 Rl 바 하여 문왕 (r1 王) • 지 도(知道)의 2 편이 더 많았고, 그 나머지 20 편도 장구( 章 句)가 『노논어』보다 상당히 더 많았다 한다. 40) 『노논어 』는 노나타에 전해 지 던 판본으로 『고논어 』와 내 용이 비 슷하 였 다. 그러 나 전한(前f!A) 만년부터 는 장우(張禹)가 편정 (編定)한 『논 어』가 주로 세상에 읽히게 되었는데, 그는 『노논어』를 공부한 위에 『제논어』도 배운 사람이었다 .41) 그는 대체로 『노논어.!l의 체재로 『논 어討문 정리하여 42) 지금 우리에게 『노논어』가 전해지고 있다고 생 각 하는 이 들이 많으나 그 장철 ( 浮 節)이 나 자구(字句)는 『제 논어 』도 참 고하였으므로 꼭 『노논어』 그대로가 전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39) 桓諏 『新論』 (『經典釋文』 敍錄 所引) 根操.
40) 何是 『論語渠解』 序 依媒
41) 『漢만』 張禹傳 및 上同간 依J1! .
42) 『隋간』 經籍志
『논어』는 보통 공자와 유가의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칙접적 인 자료라 믿고 있지만, 거기에도 꼭 믿을 수만은 없는 기록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논어.!]의 앞 10 편과 뒤 10 편은 문장의 형식이 나 어법까지도 차이가 나서, 오태 전부터 뒤 10 편은 앞의 것들보다 후세에 이루어전 의십스런 자료들도 섞여 있는 것들이라 의심을 받 아 왔다 . 특히 최 술(崔述 1740~1816) 은 『수사고신록(洙酒考信錄)』에 서 『논어』 속의 의십스런 기록들에 대하여 많은 고증을 하였고, 다 시 『논어여선(論語除說)』에서는 『논어』의 끝머리 牛탄에 의십스런 것 들이 가장 많고, 앞 편들의 끝머리 부분에도 역시 의십스런 것들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는 이것을 모두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6 장 2 철 ; 의십스런 사실 6 장 ; 뜻은 의십스럽지 않으나 문체가 다른 것 9 장; 문체가 크게 의심스러운 것 2 장 ; 문인(門人)이 공자 앞에서 부자(夫子)라 부르고 있고. 사실도 의 십스러운 것 2 장;
약간 의십스럽기는 하나 뜻에 있어서는 잘못됨이 없는 것 2 장 ; 사실도 의십스럽거니와 편말(篇 末 )에 붙어 있으면서 그 앞의 굳 들과는 비숫하지 않거나 테어먹은 곳이 있는 것 5 장 ; 이상 모두 합치면 『논어』의 의십스런 대목이 32 장 2 절이나된다. 예 를 들면 양화(腸貨)편에 공산불요(公山弗提)가 바 (J!t)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공자를 초청했던 얘기와 펄힐(佛肝)이 중모(中牟) 땅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공자를 초청했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최술 (崔述)은 공산불요가 공자를 · 초청했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고, 더우기 필힐의 모반은 공자가 죽은 뒤 5 년 후의 일임을 고증하 고 있다. 이처럼 의십스런 대목들이 있는 것은 오렌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전 중국의 전적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같은 것일 듯하다. 문학사상 『논어』가 지니는 중요한 의의논 그 속에 중국 전통문학 사상의 바탕이 된 공자의 시에 관한의견이 담간 말들이 들어 있다 논 접이라 할 것이다. 보기를들면 공자는위정(爲政)편에서 「『시경』 은 한 마디 로 표현하면 생 각에 사악(邪惡)함이 없는 것 이 다. (詩三百, 一言以薇之, 曰思無邪.)」하였고., 팔일(八{유) 편에서는 「관저(關雅 )4” 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는 않고, 슬프면서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關賜 樂而不ire, 哀而不傷.)」고 하였는데, 이 곳의 〈사무사(思無邪)〉 와 〈낙이 불음, 애 이 불상(樂而不溪 哀而不傷)〉은 표현이 애 매 함에 도 불구하고, 시 또는 문학의 참된 전리의 일단을 얘기한 말로 받아들 여졌다. 그 때문에 역대 중국 학자들은 이 귀철들에 대한 해석을 서 로 달리하면서도 모두 이것을 근거로 자신의 시몬 또는 문학론을 이룩하였다. 〈사무사(思無邪)〉라는 말은 시란 〈소박하고 순수한 생 각의 표현〉이란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올바론 생각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교화에 도움이 되는 굳〉이란 해석 둥 다양한 시론의 전개 가 가능한 것 이 다. 〈낙이 불음, 애 이 불상(樂而不浮, 哀而不傷)〉이 란 말 도 〈사무사(思無邪)〉라는 말과 연결시켜 여러 가지 시론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또 43) 關誰: 『詩經』 國風 周南 첫머리에 실려 있는 작풍 題名 ·
『시경』을 의운다 하더라도 정사 를 맡기면 잘 처리해 내지 못하고, 사방 에 사신으로 가서는 전문적으로 웅대하지 못한다면 비목 많이 의운다 해 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踊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 使於四方, 不能專對, 難多亦矣以爲 ? (子路 篇J 〈시〉는 홍취(興越)를 일으킬 수 있고, 사물을 살필 수 있고, 사람들과 어웅릴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게 하며, 가까이는 아버지 를 성기고 멀 리는 임금을 . 섭기게 하며, 새 침승과 풀 나무의 이름도 많이 알게 한다.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호, 可以怨;還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 木之名. 〔陽貨篇J 이에 따르면 『시경』은 정치를 하고 의교를 행하는 데에도 응용되 는 것이고, 또 사람노릇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효용이 있는 것이란 뜻이 된다. 한대 이후 선중유(誤 諭 )〉에 바탕을 둔 전동 적인 중국 시론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경』이나 문장에 대하여 공자가 말한 대목은 여러 곳에 보인다. 『논어』의 굳은 대부분이 직접화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 겅』이나 『좌전』의 경우보다도 말이나 대화들이 더욱 생동하고 있 다. 때문에 짧은 한 마디의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 찰 드러나 고 있다. 예로 옹야(雍也)편의 한 대목을 돈다. 백우(伯牛)가 병이 나자 선생님께서 위문을 가셔서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철망적이다 ! 운명이지 ! 이런 사람한테 이런 병 이 생기다니 ! 이런 사람한데 이런 병이 생기다니 ! 」 伯牛有疾, 子問之, 自岡執其手曰 : 亡之, 命矣 ! 斯人也而有斯疾也 ! 斯 人也而有斯疾也! 짧은 그의 말에 중병에 걷란 제자를 안타까와하는 공자의 십경이
찰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다몬 전적의 글보다도 그 당 시의 어체(語體)에 가까운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논어』의 글들은 아무런 그 때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는 짧은 말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문장의 표현은 분명하지만 그 말의 함의(含 義 )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대목들이 적지 않다. 보기를 들어 본다. 선생님이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니, 밤 낮으로 밉 추지 않는다. 」 子在川上, El ; 速者如斯夫, 不舍盡夜. 〔子卒篇)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봉새도 오지 않고 황하에선 도판이 나오지 않 으니, 나는 끝장이로구나 ! 」 子曰 ;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 〔子卒篇 〕 앞의 대목은 〈인생은 덧없는 것〉이란 뜻에서 한 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노력하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뒤의 말은 〈세상이 어지러워 뜻을 이루지 못하 겠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성군(聖君)이 없어 나를 알아 주는 이가 없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함축이 풍부한 언어로 받아들여 문장의 이상적인 표 현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그 때문에 후세까지도 중국의 문장은 서 사적(奴事的)인 산문에 있어서까지도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뜻이 풍부한 문장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논어』의 대화들은 표현이 생동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 의 성격이 뚜렷이 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극적 인 구성을 이룬 대목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선전(先進)편의 자로(子 路) • 중석 (曾哲) • 영 유(再有) • 공서 화(公西華)의 네 사람이 스승 공자 룬 모시고 자신의 득의(得意)한 일을 얘기하는 대목 같은 것은 연극 의 한 토막을 보는 듯하다. 『논어』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에 관한 짧은 글들을 아무런 체계도 없이 모아놓은책인데도불구하고
어떤 전적보다도 세상에 널리 읽힌 것은, 이러한 생동하면서도 간 결하고 뜻이 깊은 문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표현이냐 논접은 명확하면서도 『논어』의 대부분의 말들은 아무런 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기를 들면 위정(爲政) 편에 서 「군자는 그릇 같지 않다(君子不器 )」고 말하면서 도 왜 그러 한 가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군자란 모든 이치를 터득하고 있어 한가지 목적 에 만 쓰이 는 그릇과는 다르다」 또는 「군자란 포용 력 이 있어 일정한 양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릇과는 다르다」 는 둥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여 함축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리가 중시되어야 할 산문으로서는, 더우기 이 『논어』으1 편 찬은 사상적인 의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굳이 그러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아직도 논설문이 완 전히 자리잡히지 않았던 『좌전』과 비슷한 시기의 문장이 아닌가 생 각되게도 한다. 〈참고도서〉 『論語諺解』 4 卷, 朝鮮宣祖 命撰, 1612. 『論語栗谷諺解』 4 卷, 朝鮮 李펴 撰, 1749. 『論語渠証解說』 20 卷, 朝鮮 朴文鎬 撰, 1904. 『論語疾書』 1 冊, 朝鮮 李쩡 撰. 『論語講說』 1 冊, 朝鮮 李牌 撰 . 『論語古今注』 (『丁茶山全集』 經渠 二渠 卷 7~16) 朝鮮 丁若錬 撰 . 『東洋의 智器』 (四書譯tt) 韓國 車柱環, 乙酉文化社, 서 울, 1964. 『論語(託譯)』 韓廢 金敬坂, 光文出版社, 서 울, 1965. 『論語(莊譯)』 韓國 張基槿, 明文堂, 서 울, 1970. 『論語孔氏訓解』 10 卷, 漢 孔安國 撰. 『論語義疏』 10 卷, 魏 何옻 注, 梁 皇何 疏. 『論語注疏』 20 卷 魏 何委 注, 宋邪呂 疏(『十三經注疏』本). 『論語全解』 10 卷, 宋 陳詳道 撰 . 『論語菓注. 』 10 卷, 宋朱熹 撰(『四書集注』本). I(論語菓注考證』 10 卷 宋 金履祥 撰•
『論語正義』 24 卷, 淸 劉寶楠 撰. 『論語後案』 20 卷 淸 黃式三 撰. Confu c ian Analects , Jam es Legg e , (The Chin e se Classic s Vol. 1), Rep r in t , Univ e rsit y of Hong Kong Press, Hong Kong , 1960. The Analect s of Conf uc iu s , Arth ur Waley, Allen and Unwi n, London, 1938. Confu c iu s and the Chin e se Way, H.G. Creel, Harpe r, New York, 1960. Three Ways of Thoug h t in Ancie n t Chin a , Arth u r Waley, Rep r in t , Doubleday, Anchor Books, Garden Cit y; N.Y., 1956.
2. 『맹자(孟子)』 『맹자』논 공자 이후 증삼(曾參) • 자사(子思)에 이어 유학(儒學)의 정통울 이은 맹가(孟就 B.C.372?~B.C.289?)44) 의 처서로 전해지고 있 다. 특히 송(宋)대 에 주희 (朱 澤 )가 Ii'사서 (四 건 )』를 펴 낸 이 후 유학 의 정동적인 사상이 담긴 책이라 하여 매우 촌숭되고 널리 읽혀졌 다. 『사기 여璋凶 l 의 맹 가순경 열전(孟ipJ荀卿列傳)에서
) 生卒年代는 元 程復心 『孟子年譜』 依操.
맹가는……물러나 만장(萬章)의 무리들과 『시경』 • 『서경』을 정리하고 공자의 뜻을 이어 받들어 『맹자』 7 편을 지었다. 孟阿……退而與萬 章 之徒, 序詩 書 , 述仲尼之慈, 作孟子七篇.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 漢 )대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Ii'맹 자』는 맹자가 손수 지은 책이라 믿어 왔다. 그러나 이미 당이 E) 대 의 한유(韓急 768~824) 가 「Ii'맹자』는 맹자가 손수 지은 것이 아니타 맹자가 죽은 뒤 그의 제자 만장(萬章) • 공손추(公孫丑)가 서로 맹자 가 말했던 것을 기록한 것 (孟朝之 핼 非朝自著. 朝槪沒, 其徒萬章公孫 丑相與記朝所 言 耳.)」 〔答張籍 醫 〕이라고 말한 이후, 많은· 학자·둘이 그. 의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Ii'맹자』에 보이는 임금 들 중에는 맹자보다 오래 산 사람들이 있는데도 모두 죽은 뒤 불이 는 시호(盆號)를 쓰고 있고, 맹자의 제자들까지도 악정자(樂正子) • 공도자(公都子) • 옥려 자(屋盧子)처 럼 촌칭 인 〈자(子)〉를 붙이 고 있으 며 「맹자왈(孟子曰)」하고 시작하는 둥 제 삼자가 맹자의 언행을 기 목하는 식의 말투가 많다는 것 등을 근거로 『맹자』가 맹자 자신이 지은 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Ii'맹자』도 다른 제자서(諸子 書 )들 과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전국 만년에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좋을 것이다. 『맹자』는 양혜왕여걷惠王) • 공손추(公孫丑) • 등문공얘용文公) • 이루
(離媒) • 만장(萬흉) • 고자(告子) • 진 십 (盡心)의 7 편으로 이 루어 져 있 고, 또 각 편은 모두 상(上) • 하(下)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통이다. 이 편명은 각 편의 첫 귀에서 두자 또는 세자를 가리어 붙인 것이 며, 이것들은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배열된 것은 아니다. 『맹자 』 각편에는 맹자의 정치활동 • 정치이론 • 철학사상 • 개인수양 둥에 관 한 얘기가 『논어』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한 대화의 형석을 빌어 기록 되어 있다. 다만 『논어』의 간결하고 소박했던 형석이 『맹자』에서는 장편의 거창한 형석으로 발전하였고, 문장 표현이나 논리가 『논어』 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은 『맹자』가 『논어』보다는 약 100 년 정도 뒤에 이루어전 때문인 듯하다. 『맹자』의 대화 형식이 『논어』보다 장편의 거창한 것으로 발전했 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맹자의 언동이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 의 제자들에 의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것일 가능성을 느끼게 한 다. 『맹자』 첫머리에 보이는 맹자와 양혜왕 및 제선왕( 齊宣王)과 의 대화를 보기로 들어보면, 설사 어떤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처럼 간 대화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체로 맹자의 사상과 행장을 바탕으로 후세 사람이 다시 엮어 놓은 대화라 보아 야 할 것이다. 이 대화가 허구적인 것이기에 『맹자』의 사상이 구체 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기의 논거로 『시경』과 『서경』을 이용하 며 적철하고도 재미있는 풍부한 비유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기로 양혜왕 편의 첫머리 둘째 대목을 돈다. 맹자께서 양해왕을 뵈었다. 왕은 늪가에 서서 크고 작은 기러기와고타 니 사슴 따위를 둘러보면서 말하였다. 「현량여良)한 사람도 이런 것을 줄기나요?」 맹자께서 대답하였다. 대량한 사람이어야만 이런 것을 즐겁니다. 현량치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즐기지 못합니다. 『시겅』에 이런 대목이 있읍니다. 영대 (盛熹 )45) 터를 재기 시작하여 45)안 盛에 臺있 었周다 .文 王의 臺名, 靈臺는 〈훌둥한 豪〉의 뜻이고, 王이 사냥을 줄기 는 동산
재고 이룩하고 하니, 백성들이 일을 도와 며칠 안 가 완성시켰네. 터를 재기 시작하며 서두르지 말라 하였으되 백성들 자식들처럼 모여와 일했네. 왕이 영 유(盛圓 )46) 에 계 시 는데 암사슴 수사슴 엎드려 노네 . 암사슴 수사슴 살져 윤이 나고 백조는 깨끗하고 회네. 왕께 서 영 소(靈沼 )47) 에 계 시 는데 아아, 가득히 고기들 뛰어 노네. 문왕은 백성의 힘에 의하여 대도 이룩하고 늪도 이룩하였으며,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어 그 곳의 대를 영대라 불렀고, 그 곳의 늪울 영소 라 불렀으며, 그 곳에 고라니 사슴과 물고기 ·자라들이 있는 것을줄겼옵 니다. 옛날 사람들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겼기 때문에 즐길 ~ 있었 던 것입니다. 탕서(湯뽑 )48) 에 「이 날은 언제나 없어지려나? 나는 너와 함께 죽어버리겠다」 49) 고 하였읍니다.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 함께 죽어버 리려 한다면, 비록 대(臺)와 못과 새와 침승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가 있겠읍니까?」
46) ~輝 固는 새와 짐승을 보호하고 있다가 王이 사냥을 출기는 장소, 靈固는 周 文王의 固 이름.
47) ~置 文王의 동산에 있는 못으로 낚시를 줄기는 곳.
48) 沿팝 『간經』 商합의 篇名.
49) 殷나라 架王의 暴政을 참다 못해 백 성 들이 원망굴 H 즌 말, 여 기 의 〈너 〉는 架王운 가리킨다.
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雅鹿鹿, 曰;賢者亦樂此平?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難有此, 不樂也• 詩云 ; 經始函臺, 經之營之 ; 庶民 攻之, 不日成之. 經始勿返, 庶民子來. 王在露團, 座鹿依伏.팸鹿福潘, 白 鳥鶴鶴. 王在靈沼, 於初魚躍. 文王以民力爲값爲沼, 而民歡樂之,謂其臺曰 磁磁 謂其沼曰靈沼, 樂其有腹鹿魚階. 古之人與民借樂, 故能樂也. 湯쨩 曰;時日害喪, 予及女借亡. 民欲與之借亡,難有盜池鳥獸, 登能獨樂哉? 그런 중에도 문장의 내용이 거침없는 격류처럼 변화를 하며, 활발
히 생동하고 기세가 충만하다. 이는 아무런 질서나 의리도 없이 약육강석을 일삼던 전국시대라 는 혼란 속에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의(仁 義 )를 바탕으로 하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신념과 그 윤리를 실천해 보려던 뜨 거 운 정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의 소산율 적극적으로 주장 하는 한편, 양자( 楊 子)나 묵자( 墨 子) 같은 이단에 대한 배척에도 직 극적인 것도 그 시대 상황과 그의 정열에 말미암는 것이다. 그 때 문에 그의 문장은 한편 웅변적아고 선동적이며 격정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웅변적이면서도 논리는 그다지 완벽한 편이 못 되어, 도리어 시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면서도 그의 문체는 무리가 없고 깨끗하여 비교적 뜻을 파악하기 가 쉽 다. 청 (淸)대 의 오민수(吳敏樹, 1805~1873 ) 가 『맹 자』의 굳이 「가인상어(家人常語) 같다」 50) 고 표현한 것도 그때문이다. 자기의 주 장을 확실하고 빠침없이 남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결국 그의 문체를 〈가인상어〉처럼 만든 듯하다. 다음에 다시 한 토막의 보기를 든다.
50) 吳敏菌 『孟子別紗後』; 「今而讀孟子之 밤 , 如家人常語然, 器不以其文之 善 平 ? 然 則所謂文以明道者, 必如孟子而可焉. 」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상대 (三代 )51) 때에 천하를 얻었던 것은 인(仁) 함 때문이었고, 그 때 천하를 잃었던 것은 불인(不仁)했던 때문이었다. 나라들이 펴페하거나 홍성해지고 찰 지탱되거나 망하게 되는 까닭도 역시 그러 하다. 천자가 인하지 않으면 천하를 보전치 못하게 되 고, 제 후가 인 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전치 못하게 되 며 , 경 대 부(卿大夫)들이 인하지 않 으면 집 안올 보전치 못하게 되 고, 서 민들이 인하지 않으면 그의 몸을 보. 전치 못하게 된다. 지금 죽고 멸망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불인(不仁)을 즐긴다면, 그것은 마치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무리하게 술을 마시는 거나 같은 것이다.」 孟子曰 ; 三代之得天下也以仁, 失其天下也以不仁. 國之所以與廢存亡者, 亦然. 天子不仁, 不保四海;諸侯不仁, 不保社稷; 卿大夫不仁, 不保宗廟; 士庶人不仁, 不保四體. 今惡死亡而樂不仁, 是猶惡醉而强酒. 〔離裝 上J
51) 三代: 옛 날 夏 • 殷 • 周의 三王朝.
이 때문에 『맹자』의 굳은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한편 힘과 정 열까지 실려 있어 다론 어떤 제자(諸子)들의 문장보다도 강영력이 크다. 거기에다 뛰어난 비유의 활용과 해학성의 발휘는 허구적인 수법 과 어울려서 짧은 소설과 같은 굳울 이문 대목도 여러 군데 눈에 뜨인다. 다시 그러한 보기를 들어 본다. 제( 齊) 나라 사람으로 한 아내와 한 칩을 집에 데리고 사는 자가 있었 다. 그 남편은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서는 돌아왔었다. 그 의 아내가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을 물어보면 모두가 부자이고 귀한신분 의 사람들이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첩에게 말하였다. 「주인께 서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 를 실컷 자시 고 돌아오시 는데 , 함 께 음식을 자신 사람을 물어보면 모두가 부자이고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오. 그러나 아칙도 유명한 사람이 와 본 일은 없으니 나는 몰래 주인이 가는 것을 따라가 보려오.」 그리고 일적 일어나 숟며시 남편이 가는 곳을 따라갔는데, 나라 안을 두루 다니면서도 함께 서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는, 등쪽 성 밖의 무덤 사이의 제사지내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찌꺼기를 구결하고 논 부족하면 또 둘러 보면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곤 하였다. 이 것이 그가 실컷 먹는 방법이었다. 그의 아내는 돌아와서 그의 첩에게 말하였다. 「남편아란 우러러보면서 평생을 의지할 사람인데, 지금 그이는 이런 꼴이오.」 그리고 그의 컵과 함께 그의 남편을 나무라면서 마당 가운데에서 함께 울었다. 그런대 도 남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으시 대 면서 밖으로부터 돌 아와 그의 아내와 첩에게 뽐내었다. 군자의 눈으로 볼 적에 사람들이 부귀와 이익이나 출세를 추구하는 방 법이 그의 아내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울지 않게 하는 일이 극 히 드문 것이다. 齊人有一妻一妄而處室者, 其良人出, 則必緊酒肉而後反.其妻問所與飮食 者, 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妄曰 ; 良人出則必緊酒肉而後反, 問其與飮食者, 盡富貴也, 而未常有顯者來. 吾將鬪良人之所之也. 蓬起, 施從良人之所之. 循國中, 無與立談者, 卒之東郭潘間之祭者, 乞其餘, 不足, 又顧而之他.此
其爲器足之道也. 其妻 &ITT, 告其妄曰 ; 良人者, 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 其妄油其良人, 而相泣於中庭. 而良人未之知也, 施施從外來, 緊其妻妄.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쌌利達者, 其妻妄不盤也, 而不相泣者, 幾 希矣. 〔離媒 下J 이 런 비유의 뜻이 담긴 얘 기를 우언(腐 言 )이 라 하는데 , 실상 이 러한 우언은 소설의 수법에서 볼 때 후세의 이른바 지괴소설(志怪小說)보 다도 상급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우언을 이용한 자기 논리의 전개 는 『장자(莊子)』나 『한비 자(韓非子)』 같은 데 에 서 도 많이 이 용되 고 있는 수법이다. 이는 제자(諸子)들의 자기의 주장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뚜렷이 이해시키려는 노력에서 이런 우언이 발달한 것 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평이하고도 깨끗한 문체를 쓰면서도 자기 주장에 대 하여 적극적이고 정열적이어서 기세가 있고 감화력을 느끼게 하는 『맹자』의 산문은 후세 중국 산문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사상면에서는 『논어』가 『맹자』보다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중국 산 문사에 있어서의 지위는 오히려 『맹자』가 훨씬 높다 하겠다. 특히 당여f)대 이후의 고문가(古文家)들, 한유(韓急) • 유종원(柳宗元) • 소 순(蘇海) • 소식 (蘇試) 등이 모두 『맹 자』를 그들 문장의 규범 으로 삼 으려 하였다. 때문에 후세 중국의 고문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장교 본으로 받들어졌던 것이 『맹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참고도서〉 『孟子諺解』 14 卷, 朝鮮 宜祖 命撰. 1612. 『孟子栗谷先生諺解』 7 卷, 朝鮮 李펴 撰. 1749. 『孟子凌說』 10 卷, 朝鮮趙翼 撰. 1615. 『孟子疾 書 』 4 卷, 朝鮮 李漢 撰. 『孟子講說』 1 冊, 朝鮮 李縮 撰. 『孟子要義』 (li'T茶山全 書 』 經集二集 卷 5~6) 朝鮮 丁若鏞 撰. 『孟子(注譯)』 韓國 車柱環 明文堂, 1970.
『 孟 子( 注譯 ) 』 韓國 , 安炳 周, 李災衡 , 李 災 九 共i짱 , 翰林 出 版社 , 1982. 『 孟 子 注疏』 14 卷 後淡 趙岐 注 , 宋 孫奭 疏(『十 三 經注疏』本 ). 『 孟 子 渠注』 7 卷 , 宋 朱熹 撰(『 四 書菜 注 』本 ). 『孟子正 義』 30 卷 淸 魚循 撰 . 『 孟子字 義疏證』 3 卷 , 淸 戴震 撰 . The Works of Me nc iu s , Jam es Legg e , (The Chin e se Classic s Vol. 2), Rep ri n t , Univ e rsit y of Hong Kong Press, Hong Kong , 1960. Me nc i us , A New Translati on , W.A. C .H . Dobson, Univ e rsit y of To-ronto Press, Toronto , 1963. Menc ius on the Mi nd , I.A . Ric h ards, Keg an Paul, London, 1932.
3. 『묵자(墨子)』 『묵자』는 묵가(器家)를 대 표하는 유일한 처 술로서 묵가를 창시 한 묵적 (墨視 B.C.468?~B.C.376?)52) 의 처서로 알려쳐 있다. 묵적은 대략 공자가 죽은 뒤 10 년 전후 되는 해에 태어나서 맹자가 태어나 기 십여년 전에 죽은 듯하다 .53) 전국시대만 하더라도 묵가는 유가 와서로다물만한 세력을 지녔던 학파여서, 『맹자』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열을 을려 묵가의 사상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한 (漠)대에 이르러는 이미 묵가의 명맥이 다 끊긴 형편이 되어 버려 지금 우리에게는 묵적에 대하여 올바른 전기(傳記)가 하나도전해지 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사기(史記)』의 맹자순경열전(孟子荀卿 列傳) 끝머리에 묵쳐온 송나타의 대부로서 성울 방비하는 술법을 잘 알았고철용(節用) 울 주장하였다. 혹은 공자와 같은 시대라기도 하고 혹은 그보다 뒤 사람 이라고도 한다. 蓋墨亂 宋之大夫, 善守禦,爲節用. 或曰並孔子 ·I 店, 或曰在其後. 는 간단한 기록이 있을 분이다. 그러나 양계초(梁啓超, 1873~1929) 같은 사람은 그를 노(魯)나라 사람이타 고증하였고 .54) 또 초(楚)나 라 사람이타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다.
52) 孫話讓 『墨子年表』엔 「 B.C .4 68~B . C. 376 」, 錢穆 『墨子年表』엔 「 B . C .4 79~B.C. 381 」로 考證하고 있다-
53) 梁啓超 『子感子學說』 墨子略傳 依操.
54) ·孫胎讓 『墨子後語』 卷上 및 梁啓超 『子晟子學說』 墨子略傳.
『묵자』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는 본시 수레 만드는 일도 한 서민 출신인듯 하며, 그 때문에 당시 사회의 모순이나사치와 예악(禮樂) 같은 것에 강한 반발을 보이는 실천적인 서민계급울 대표하는 사상 가로 발전한 듯하다. 당시 의 지 주계 급을 대 표하는 유가의 예 교사상 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몸울 수고롭히지도 않고, 오곡(五穀)을 분
별하지도 못하는」 5 5) 유가란 그 사회에 있어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의 혼란과 인간의 불행은 서로가 미워 하고 싸우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 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겸애 예遷i)〉를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모돈 사람이 절약하고 검소하게 지내면서 부지런히 일할 것 도 주장하였다. 이런 것 모두가 서민의 입장울 대표하는 주장이라 할 것아다. 묵가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학파라는 것도 이에 일맥 상통하는 목칭이다. 그 위에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하늘〉에 대한 신앙에 두었기 때문에(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귀신의 존재로 믿었다), 그의 이러한 주 장들은 모두 경전함과 성의를 느끼게도 한다.
55) 『 論語 』 微子; 「四惡不動, 五穀不分.」
『한서(漢럽)』 예문지에는 『묵자』 71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1 混꾼 6) 은 없어지고 지금은 53 편이 전한다. 『수서(隋 密 )』 경적지(經 籍志) 에서는 『묵자』 15 권이라 했는데 지금도 53 편이 다시 15 권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이 53 편의 내용도 편에 따라 성격상 큰 차이 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묵자의 제자들과 후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전 여러가지 굳둘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인듯하다. 대 략 이 53 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57) 첫째 ; 권 1 의 찬사(親士), 수신( 修身 ), 소염(所染), 법의(法儀), 칠 환(七患), 사과( 辭過 ), 상변(三辯)의 7 편. 둘째 : 권 2 에서 권 9 에 이르는 상현(尙賢) 상 • 중 • 하, 상동(尙同) 상 • 중 • 하, 김 애 @誘f) 상 • 중 • 하, 비 공(非攻) 상 • 중 • 하, 절용(節用) 상 • 중, 절장(節葬) 하, 천지 (天志) 상 • 중 • 하, 명구1 (明鬼) 하, 비 악(非樂) 상, 비 명 (非命) 상 • 중 • 하, 비 유(非t{i) 하의 243 忠 제 째 ; 권 10 • 11 의 경 (經) 상 • 하, 경 설 (經說) 상 • 하, 대 취 (大取), 소추] (小取)의 6 편• 네째 ; 권 11, 12, 13 의 경주(耕柱), 귀의 (貨義), 공맹 (公孟), 노문
56) 18 篇 中 8 篇온 篇名만 傳해지고 있음.
57) 대체로 梁啓超 Jj'墨子쭈案.!I의 說을 따랐옵 .
(魯 間 ) , 공수 (公輸)의 5 편. 다섯 째 ;권 14, 15 의 비 성 문 (V iii城門) , 비고립 ( i /i i? 』臨i) , 비제 (V1 i i t弟) , 비 수 ({J1 l i 水) , 비 둘 (세國) , 바 혈 (세ii穴) , 비 아부 ( V1 l i峨 {(I J) ' 영 적 사( 迎敵祠) , 기치 (旗t波) , 호 령 ( 號令 ), 잡수 (셨{t守) 의 11 편 . 이들 가운데 묵자의 사상을 가장 직 접적으로 대 표 하고 있는 것 은 둘째 2~ 틴이 다. 그러 나 이 것 들도 모두 「묵자께 서 말씀하시 기 를 (子 墨 子曰)」 하고 문장을 시 작하고 있으니 그의 제 자 들 의 기 록임 이 들 림없다. 혼히 끝머리의 비유( 非儒 ) '5Jd _-을 빼 고 나머지 열가지 를 묵 가 사상의 «]조강령 (十條 綱領)〉 이라고 말한다. 이 밖에 첫째 7 편 은 순수한 묵가의 사상이라 보기 어려운 대목도 있어, 십지어 후세 사람들의 위탁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58 ) 후세의 묵가분만이 아 니라 묵가 이의의 사람들 손길까지 닿은 부분이라 보는 게 옳 을 것 이다. 세째 6 편은 묵자의 논리학에 관한 기록으로, 경( 經 )과 경설 (經說)은 비교적 묵자의 이론을 직접 전한 것인듯 하나 모두 후세 제자들의 기목일 것이다. 네째 5 편은 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 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으로 역시 후세 제자들이 쓴 , 것이다. 다섯째 11 편은 모두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하는 전술을 기술한 것이 다. 이는 묵자의 비공(非攻)의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발달시킨전 술을 후세 묵가들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58) 黃建中 『墨子 書 分經 辯 論三部考辨』 (『古史辨.!I 六), 梁啓超는 『墨子學案』 等 에서 첫 머리 3 篇이 後人의 僞託이라 하였다.
『묵자』는 사상에 있어 당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 지 만, 문장 자체도 그러한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그 문체는 일상용어에 가까운 질박한 것이고, 문장에는 부화( 浮華 )한 아름다운 표현이나 화려한 수식이 없다. 이는 그의 사치와 예악( 禮 樂)을 반대 하고 근겁울 주장하는 사상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53 편의 편명들은 모두 각 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적당 히 그 편의 첫 귀철에서 두세자를 취하여 편명을 삼았던 다른 옛날 의 전적들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그것은 대체로 [j'묵자』로부터 중국의 문장이 본격적인 논설울 전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j'묵자』가 중국산문사상 논변문(論辯文)의 선
하(先河)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편의 내용도 대화의 수법을 쓰지 않고 대부분 본격적인 논설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편폭도 매 우 길어져 있다. 아레에 겸애(兼愛 ) 상편 첫머리 한 대목을 보기로 들어 본다. 성 인이 란 천하를 다스리 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반드시 혼란아 일 어나는 까닭을 알아야만 이에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혼란이 일 어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곧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비유 를 듣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다. 반드시 병이 생겨난 까 닭을 알아야만 이에 병울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병이 생겨난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곧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혼란을 다스리는 것도어 찌 그령지 않겠는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난 까닭을 알아야만 이에 친하 몰 다스탈 수가 있게 되고, 혼란이 일어난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곧다스 런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성 인이 란 천하를 다스리 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니 , 혼란이 일어 나는 까닭을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일찌기 살펴보건대 혼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하와 자식이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도리에 어 굿나는 짓을 하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식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아 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 는 것 이 다. 아우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도 형 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형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신하는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임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바 혼란인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애롭지 않고 형이 아우에게 자에롭지 않고 임금이 신하에게 자애롭지 않은 것도 역시 천하의 이론바 혼란인 것이다. 아버지 는 자신은 사랑하면서 도 자식 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자식 을 해치 면서 자신을 이몽게 하는 것이다. 형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아우는 사랑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우를 해치떤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임 금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신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를 해 치면서 자산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가 서로 사탕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聖人, 以治天下爲事者也. 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 不知亂之所自起,
則不能治. 菩 之, ln 醫之攻人之疾者然. 必知疾之所自起, 惡能攻之 ; 不知疾 之所自起, 則弗能攻. 治亂者, 何獨不然 ? 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 不 知亂之所自起, 則弗能治. 聖人, 以治天下爲事者也. 不可不察亂之所自起. 當察亂何自起 ? 起不相愛. 臣子之不孝君父, 所謂亂也. 子自愛不愛父, 故廊父而自利. 弟自愛不愛兄, 故沼乃兄而自利. 臣自愛不愛君, 故晶芳君而自 利 此所謂亂也. 難父之不慈子,兄之不慈弟, 君之不慈臣, 此亦天下之所謂亂也. 父自愛而 不愛子, 故朗子而自利 兄自愛而不愛弟, 故批羽弟而自利. 君自愛而不愛臣, 故朗臣而自利. 是何也? 皆起不相愛. 그는 사람이란 모두 자기와 남의 구벌없이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검애〉를 주장하기 위하여 먼처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을 논증하고 있다. 이 뒤로도 세상에 도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서로 사 랑하지 않는 때문임을 논증한 다음에야 〈그러니 사람들은모두가서 로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묵자』의 경 (經) 상 • 하편, 경설(經說) 상 • 하편 및 대 추] (大取), 소취 (小取)편에 보이는 묵자의 논리학 연구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학자들이 『묵자』에 있어서의 논리의 발달을 큰 업적으로 평가 하고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묵자』의 논리는 벌로 정확하다 고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지리하고 단조롭다. 그 때문에 서양 학자 들 중에는 59) 『묵자』의 굳이 논리도 엉성하거니와 아름답지도 않고 멋도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의 문장은 한자의 목성 때문에 완벽한 논리나 정확한 뜻의 전달보다도 함축적이면서도 간 략한 표현에서 그 득칭을 찾아야 하는 돗하다. 그러나 뜻의 전달은 문장의 기본 기능이므로 현대인의 눈에는 엉성하게 보인다 하더라 도 『묵자』에서 두드러지는 수식 없는 정확한 뜻의 전달 노력은 중국 산문을 다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공헌을 랬다고 볼 수 있다. 다 59) Arth u r Waley: Three Ways of Thoug h t in Anc ien t Chin a . Burto n Wats o n: Early Chin e se Lit er at1 1 re.
시 말하면 『묵자』를 바탕으로 중국 산문은 본격 적 인 논설울 전 7 사 할 수 있게 되고, 뜻의 표현 기능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었던것이다. 〈참고도서〉 『墨子(注 譯 )』 韓國 金學主, 明文堂, 서울, 1977. 『墨子 b1 話』 15 卷 目錄 1 卷, 附錄 1 卷, 後語 2 卷, 淸 孫話讓 撰. 『墨子學案』 民國 梁啓超 撰. The Et hi c a l and Politi ca l Works of Mots e , Y.P. Mei, Probsth a in , Lon-don, 1929. Mots e , the Neg le cte d Ri va l of Conf uc iu s , Y.P. Mei, Probsth a in , London, 1934. Three Way s of Thoug h t in Ancie n t Chin a , Arth u r Waley, Rep r in t , Doubleday, Anchor Books, Garden Cit y, N.Y., 1956. Mo Tzu; The Basic Writ ing s , Burto n Wats o n, Columbia Univ e rsit y Press, New York, 1963.
4. 『장자(莊子)』 『장자』는 장주(莊周 B.C.369 ? ~B.C.286 ? )60) 의 저 술로서 , 『노자(老 子)』 • 『열자(列子)』와 함께 도가(道 家)를 대 표하는 책 으로 알려 져 있 다. 『사기 (史記)』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에 는 그에 관한 간단한 전기가 있으나, 그의 생애에 대하여는 알려진 게 극히 적다. 이름 이 주(周)이고 몽( 蒙 )6 1) 사람이며 , 노자의 설을 근본으로 하여 십여 만언(十 除菓言 )에 이르는 책을 썼다는 게 그 중요한 줄거리이다. 대 략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산 듯한데, 장자와 맹자는 서로 상대방의 촌재를 알지 못했던 듯하다. 어떻든 노자보다는 그 생애가 확실하 고 책의 내용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장자를 도가사상의 개산대종사 (開山大宗師)라 주장하는 학자조차도 있 다. 62)
60) 馬夷初 『莊子年表』 (『天馬山房穀書』) 依操. 61) 蒙: 지금의 河南省 歸德府 商丘縣. 62) 錢穆 『老莊通辨』
『한서 』 예 문지 에 는 『장자』 52 편이 수록되 어 있으나, 63) 지 금은 33 편만이 전한다. 당나라 초기의 육덕명(陸 德明) 의 『경전석문(經典釋 文)』 서록(叔錄)에 열거하고 있는 전(晋)나타 때의 『장자』 주해서를 보면, 『최선주(崔讀注)』 10 권 27 편, 『향수주(向秀注)』 20 권 26 편, 『사 마표주(司馬彩注)』 21 권 52 편, 『곽상주(郭象注)』 33 권 33 편, 『이이집 해 (李願集解)』 3(}:;신 30 편 , 『맹 씨 주(孟氏注)』 18 권 5 2>탄 , 『왕숙지 의 소 (王叔之義疏)』 3 권 둥이 있 다. 여 기 의 5 2>인본도 한대 ( 漢代 )의 『장자』 와는 내용이 같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전해지 는 동안 『장자』의 판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가를 침작하고 도 남음이 있게 한다. 이 가운데 『곽상주』본 33 편이 우리 에 게 전해 지고 있는 것이다.
63) 『呂氏春秋』 必己篇 高誘注에도 『莊子』 五十二篇이라 하였다.
이 33 편은 다시 내편(內篇) 7 편, 외편(外篇) 15 편, 잡편(雜篇) 11 편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내편은 문장도 뛰어나고 내용도 순수한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어, 이 부분만은 장자가 직접 쓴 것이고, 의
편과 잡편에는 잡다한 성격의 굳들이 섞여 있어 그의 제자와 후세 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편제 (篇題)도 내편은 모두 소요유 (遺地遊) • 제물론( 齊物論) 처럼 그 편의 내용과 합치되는 3 자로 된 것 인 데 비 하여 , 외편과 잡편은 변무(硏 W) • 마제 (馬節)처 럼 그 편의 첫 귀에서 적당히 2 자를 따서 편명으로 상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 떻든 내편조차도 그 편명이나 본격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문장 의 성격으로 보아 장자의 제자 손에 이루어전 글일 가능성이 많다. 『장자』가 옛 날부터 독자들에 게 청 신한 느낌 울 주며 그들의 마음 울 사로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다론 제자(諸子)들처럼 나라를 다스 리고 사회를 올바로 이끄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초국하고 있다는 접이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 저술의 독자로서 제 후나 권세가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데 비하여, 『장자』는 모든 사람 에게 얘기하여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치려 하고 있다. 『장자』 의 관십은 유가나 묵가처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사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었다. 곧 지처분한 현실문제를 뒤 어넘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추구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구한 인간 정신과 사상 의 완전한 자유는 이제껏 추구해 온 중국 사상의 경계(境界)를한총 제고시킨 것이었다. 『장자』 사상의 핵십온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인간의 자유 의 추구에 있 다. 장자는 영 원하고도 자연스런 〈도(道)〉를 바탕으로 하여 , 사람들의 크고 작다 또는 아름답고 추하다, 좋고 나쁘다, 길 고 짧다는 둥의 판단이 철대적인 것이 못 되는 그릇된 가치의 판단 이라 한다. 사람들은 이런 그릇된 가치 판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 하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제약과 불행을 안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모든 상대적인 가치 판단을초국하여, 좋 고 나쁘다는 등의 판단분만이 아니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까지도 초연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 기에 그는,
지인(至人)은 자기가 없고, 신인( 神 人)은 이문 공이 없으며, 성인(聖 人)은 이름이 없는 것이다. 至人 無 己, 神 人 無功 , 聖 人無名. 〔 遺造遊 〕 고 이상적인 인간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다. 곧 · 사람이란 아무것도 바라거 나 얻으려 는 것 없는 〈무대 ( 無待)〉 의 경 지 에 아 르러 , 무아(無 我) • 무지( 無 知) • 무언( 無言 ) • 무위(無 爲 )함으로써 〈 도의 원리에 따 타 되어가는 대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피 아(彼我)나 만물과 나의 구벌도 없는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아 무런 거리낌없는 경지에 노닐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아쿠런 갈등이나 욕망조차도 없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에게 는 아무런 구별도 없고 어떠한 한계도 있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비로소 아무것에 도 구애받지 않 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어 인간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Ii' 장자』의 초현실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그 문장에 있어서도 풍부한 상상력과 천마(天馬)가 하늘을 달리는 듯한 환상과 자유자 재하는 변화를 지니게 하고 있다. 그의 주제가 현실을 초월한 경지 의 것들이타 자연히 그 문장은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 데에도 매인 데가 없는 그의 정신과 오묘하고도 다양 한 뜻의 표현은 결국 그 독특한 문체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십오한 철학적인 이론이 전개되는가 하연 재미있고 기지가 넘치는 얘기도 나오고, 신비스런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일상 적인 세상 얘기도 나온다. 이러한 『장자』의 득징은 중국문학에 현 실적인 정치 사회 문제를 떠난 새로운 정신적 사상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눈뜨게 하였다. 결국 중국의 문장은 『장자』로 말미암아 새 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새로운 정신적 세계를 전개시킬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편은 직언제(直 言體 )나 대화의 형식을 벗어나 『묵자』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서술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편제
慣題)는 내편의 경우 각 편의 주재를 3 자로 요약하여 붙인 것아다. 의편 • 잡편 중에는우언(萬 言 ) • 양왕(談王) • 도척(盜拓) • 성검(說劍)· 어부(漁父) • 열어구(列禦Ji£) 동처럼 문장이나 내용이 내편에 바하여 훨씬 시원찮은 것들이 있기는 하나 후세 사람들이 손렌 부분도 적 지 않아 논리의 표현엔 매우 뛰어난 글들이 많다. 여하돈 『묵자』오1- 비교할 때 뜻의 표현에 있어서는 Ii'장자』 쪽이 훨씬 애매하지만 읽 어보면 퍽 멋이 있고 재미있다. 중국- 문장은 한자의 특성 때문에 이처럼 함축적이고 변화 많은 문장에서 전가를 발휘하게 되는 듯하 다. 아태에 그 보기를 한 대목 들어 본다. 견오(周吾)가 연숙(連叔)에게 물었다. 「나는 접여(接輿)의 말을 둘은 적이 있읍니다만 하도 커서 끝이 없고 나가기만 하여 걷잡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의 말에 오싹해쳐서 마치 은하(銀河)처럼 끝없는 듯이 느껴졌읍니다. 너무 크게 업청나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읍니다.」 연숙이 말하였다. 「그가 한 말이란 어떤 것이었나요?」 「막고야산(親姑射山)에 신인(神人)아 살고 있었답니다. 살찾은 얼음이 나 눈과 같고 나긋나굿하기 처 녀와 같았는데 , 오곡을 먹 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셨으며, 구름을 타고 나는 용을 물면서 이 세상 밖율 노닐었다 합니다. 그의 정신이 집중되떤 만물이 상하거나 병드는 일이 없고곡식들 도 찰 여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허황하다 여기고 믿지 않았읍니 다.」 연숙이 말하였다. 「그렇겠소 장님은 무늬의 아름다움과는 상관이 없고, 귀머거리논 악기 의 소리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어찌 다만 욱채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겠읍니까? 지각에도 역시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이 말은 바로 당신 갇온 사람에게 적용되지요. 그 신인이 지닌 덕은 만물과 함께 어울리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다면 누가 수고로이 천하를 위하여 일하겠읍니까? 그 . 신인은 어떤 물건도 그를 손상시킬 수가 없읍니다. 큰 장마물이 하늘에 닿게 된다해도 물에 빠지지 않으며 큰 가뭄에 쇠와돌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탄다 해도 드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 묻
온 먼지나 대 또는 곡식 쭉정 이와 겨 같은 것으로도 요(접g ) 임금이나 순 (舜)임금을 만들어 낸 만합니다. 어찌 물건을 위하여 어떤 일윤 하려 듄 겠옵니까?」 后吾問於連叔曰 ; 吾聞言於接輿 , 大而無'1:&., 往而不反 . 吾i¥t 1: i i其 言 , 猶河 漢而無極也. 大有速庭, 不近人fi!J,焉. 連叔曰 ; 其言 ·0 謂哉 ? 曰 ; 說姑射之山,有神人居惡. j]J Lh 序若氷雪, 浦約若處子, 不食五穀, 吸風 飮露 乘雲氣,御飛龍, 而遊平四海之外. 其神坂, 使物不iJ)B 磁而年故熟. 吾 以是狂而不信也. 連叔曰;然.뽑者無以與平文章之競, 뾰者無以與平鍾쌉之聲. 盜唯形賊有 競盲哉 ? 夫知亦有之. 是其言也, 猶時女也. 之人也,之德也, 將芳砲萬物以爲一. 世朝平亂, 執郭幣焉以天下爲事 ? 之人也, 物莫之傷. 大沒稽天, 而不活. 大早, 金石流, 土山 魚 ,而不熱. 是 其應括桃糖, 猶將陶鑄堯舜者也. 執肯以物爲 Ij r ? 〔造造遊J 여기에 대화로 아루어전 대목을 보기로 든 것은 [j'장자』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처럼 허구적인 〈우언(寫言)〉이기 때문이다. 이 〈우 언〉은 『맹자』에도 몇 군데 보이지만 고도로 발달한 소선의 기법을 활용한 굳이다. 『맹자』나 이전의 글들은 허구적이라 하더라도 거의 모두가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임을믿을 때 비로소 그 효용이 발휘되는 굳이었으나, [j'장자』의 〈우언〉은 처음부 터 그것이 일부러 꾸며전 히구적인 얘기임을 드러내놓고 있고, 또 그 〈우언〉은 자기의 이몬이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한 자료이어서 그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효용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것이 다. 이것은 곧 장자의 〈우언〉을 동해서 중국 산문의 문학성이 한충 더 높여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j'장자』의 첫머리 소요유(造造遊)편 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우언〉의 연속이라 할 수 있 다. 곧 1) 복명 (北冥)에 있는 길이 가 수천리 나 되 는 곤(蝶)이 라는 물고기와 그것이 변하여 된 큰 붕(鵬)새 얘기 , 2) 매미 (蝶)와 벱새 (學鳩) 얘 기 , 3) 아침 버 섯 • 쓰르라미 와 수만년을 사는 명 령 (冥姬)과 대 춘(大椿)이 i!-J: 나무 얘 기 , 4) 다시 곤(維) • 봉에9 ) 과 조그만 안(鷄)
새 얘 기 , 5) 송영 자(宋榮子) • 열자(列子)와 전인 (眞人) 얘 기 , 6) 요 (堯)임 금과 허 유( 許由) 의 애 기 , 7) 앞에 보기 로 인용한 견오 (周吾) 와 연숙(連叔)의 대 화, 8) 야만의 월(越)나라로 귀 족이 쓰는 관Or:E) 장 사를 간 얘 기 , 9) 혜 시 (惡施)와 장자의 대 화로 너 무나 큰 박과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쓰는 얘기, 10) 역시 혀1 시와 장자의 대화로 혹두성이어서 재목으로 쓸 수도 없는 큰 개똥나무 얘기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설명문은 극히 짧다. 아태에 잡편~~) 에 보이 는 〈우언〉 한토막을 보기 로 돈다. 유생(儒生)이 시례(詩 禮) 로서 무덤을 도굴(盜堀)하고 있었다. 큰 유생이 무덤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말하였다. 「동녘이 밝아오는데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은 유생이 대답하였다. 「아칙 수의( 壽衣 )도 벗기지 못하였으나 입 속에 구술 64) 이 있읍니다.」 「『시경』에 본시 이르기를 「푸릇푸롯한 보리, 언덕 위에 자라 있네. 살아 선 포시(布施)도 못한 주제에, 죽어서 구술은 물어 무얼 하겠는가?」고하 였다. 그의 구레나뭇울 잡고 그 턱 밑 수영을 잡아누른다음쇠꼬치로턱 을 퀘어 서서히 그의 볼을 째되 입 속의 구술은 다치지 않도록 하거라.」 儒以詩禮發象 大儒腦傳曰 ; 東方作矣, 事之何若 ? 小儒曰 ; 未解第福, 口 中有珠 詩固有之曰 ; 靑靑之麥, 生於陵阪. 生不布施, 死何含珠爲 ? 接其 裝, 壓其亂 而以金椎校其頭, 徐徐別其類, 無傷 口中珠. 〔外物〕 이 대목에는 이러한 얘기 이의에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 댜 그러나 접잖은 큰 유생이 제자인 작은 유생을 데리고 Ii'시경』을 인용하며 남의 무덤울 도굴하는 이 얘기는 유가에 대한 신랄한 비 평의 뜻이 담간 우언(寫言)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문장의 뜻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유가의 어떤 접을 풍자한 얘기 인지 꼬집어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얘기 내용아 재미 있고, 애매한 표현은 함축적인 면도 있어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 64는) 구습술관: 이옛 날있었 中다.國 에는 죽은 이에게 富者일수목 비싼 구슬을 입에 물려 장사지내
도록 만드는 이의에 깊은 인상을 십어주기 때문에, 직접 유가를 욕 하거나 바평한 글보다도 그 효과가 크다. 바로 이 점이 『장 자』의 문장상의 특칭 이 며 , 이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자』에 매 료당하고 있는지도 모론나. 어떻든 『장자』의 문장은 후세 중국 산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 다. 『장자』를 통하여 중국의 산문은 뜻의 정 확한 표현보다도 함축 적아고도 간략한 표현에서 그 특칭을 확인하게 되었던 듯하다. 그 때 문에 후세 의 고문가들에 게 까지 도 『장자』는 『맹 자』 못지 않은 규법 의 역 할울 하였 다. 다만 대 부분의 문장가들이 유학자들아 어 서 『장 자』를 『맹자』처럼 내세우지 않았을 따름인듯 하다 . 그것은 당대의 한유(韓急) 같은 도학자의 문장 속에 서 도 『장자』의 영 향을 받은 혼 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
65) 例로 韓急 『送高閑上人序』, 이 밖에 여 러 곳에 『莊子』의 文體가 발견된다. 그 밖에 歐腸修 • 蘇試 등에게서도 그 影稷온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노자(老子)』는 공자보다도 선배 인 노자의 저 서 이 며 , 그는 도가 (道 家) 의 창시 자로 알려 졌 었 다. 『사기 』의 노장산한열전 (老莊申韓列傳) 올 보면 노자는 「성은 이(李)씨이고 이름은 이(耳)이며 자는 백양 (伯陽)이고 시 (盆)를 담(lfil})이라 하였다」 하고, 또 「관령 (關令) 윤희 @ 喜 )의 요청으로 도덕( 道德) 의 뜻을 말한 오천여언(五千 餘 言 )의 책 상하편(上下篇)을 지 었 다」고도 하였 다. 그러 나 또 「혹은 말하거 를 노래자(老萊子)도 초(楚)나라 사람인데 도가의 말을 써서 책 15 편을 썼는데 공자와 같은 시대였다」 하고, 다시 「혹은 말하기를 태사(太 史) 담(俗)이 곧 노자라고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 세 상에서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이가 없다」고도 하였다. 그 러니 이미 한(漢)대의 사마천(司馬遷 B.C . 145~B.C.86? )조차도 노자 의 생애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서 『사기』에 전기를 썼던 것이다 . • 그리고 후세에는 노자는 「이름이 이 (耳)고 자가 담 (IlD 」이타는 사람 도 많다 .66) 그래서 전목(錢穆) 같은 이는 노자를 「중국 고대 전설 중의 박대(博大)한 전인(眞人)」이며 『노자』는 『장자』보다도 후세에 이루어전 책이라 하였다. 그리고최술(崔述) • 왕중(江中) • 양계초(梁
66) 唐 司馬貞 『史記索隱』, 唐 章懷太子 『老子注』 等 .
啓超) 같은 사람들은 『 노자』가전국시대 저술임을 고증하기도 하였 다 .67) Ii'노자』의 문장이 대화체가 아니고, 짧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상을 서술하고 있는 수법을 보더라도 68) 전국시대 중엽 이후의 책 일 가능성 이 많다. 69) 그러 나 Ii'장자』 천하편에 노자의 사상을 논술한 대목이 있고, Ii'순자(荀子)』와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노자 사상을 비판한 굳이 보이고, 『한비자(韓非子)』에는 해로(解老)편 • 유로(兪老) 편 같은 『노자只분 해 설한 글이 있으며 , 『전국책 』에 선 유세 (遊說)하 는 사람들이 『노자』를 인용하고도 있으니, 전국시대 말엽에는 이 책이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졌었음을 알겠다.
67) 崔述 『洙酒考信錄』, 注中 『老子考異J, 梁啓超 『評胡適之中國哲學史大綱』 等 .
68) 馮友蘭온 『中國哲ii 上』 上冊에서 「老子는 簡明한 經體」이니 戰國時代 作品일 것이라 하였다.
69) 梁啓超 『評胡 適 之中國哲學史大綱』, 錢穆 『關於老子成반年代之一種考察』 • 『再 홉 老成완年代』에선 戰國 末葉의 作品이라 하였다.
『노자』는 짧은 글귀 로 된 81 철(節)의 굳이 상 • 하 두 편으로 나뉘 어져 있다. 상편을 도경(道經), 하편을 덕경(德經)이라고도 하여 ,70) 이 를 합쳐 혼히 Ii'도덕 경 (道德經)』이 라고도 부른다. 이 들 각 절은 형 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아무런 연관이나 체계가 없는 굳둘 이다. 그러나 이 책이 도(道)와 우주의 근원 같은 형이상학의 문제 를 본격적으로 논한 최초의 저술이어서 후세 중국사상사에 끼찬 영 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문장은 도가의 금언집(金言 集 ) 같은 성격의 것이며, 고 도로 상칭화한 표현은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Ii'노자』 의 첫 철을 보기로 돈다. 도(道)라고 알 수 있는 도는 절대 불변하는 도가 아니다. 명칭도 부를 수 있는 명칭은· 철대 불변하는 명칭이 아니다. 무명 (無名)이 천지의 시작 이며,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머니인 것이다. 언제나 무(無)는 그 묘용 (妙用)을 보이 려 하고 언제 나 유(有)는 만물의 차벌상(差別相)을 보이 려 한다. 이 두가지는 같은 데서 나왔으나 명칭이 다른 것이다. 이 갈은 접 을 현 (玄)이 라 말한다. 현이 다시 현묘(玄妙)하게 작용하는 것 이 여 러 오
70) 1974 年 大陸의 長沙 馬 王推에서 漠初의 用합 Ii'老子』 7}- 發擇되었는데 , 이는 德經 이 앞머리에 있고 道經이 뒤에 붕어 있다 .
묘한 현상의 문 (P1) 인 것이 다. 道 可 道 , 非常道;名可名, 非常名 . 無名 , 天地之始;有名,葉物之母. 常 無, 欲觀其妙 ; 'i K 有, 欲亂其激 此兩者, 同出而典名. 同, 謂 之玄. 玄之又 玄, 衆妙 之門• 번역에 최선은 다했지만 또 다른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문 을 끊는 데에도 학자에 따라 이견(異 見 )이 있다. 그분 아니라 절에 따라 문체도 다르며, 십지어는 압운(:jfJl 韻 )울 한 운문체의 글도 있어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닌 듯하다. 따라서 『노자』의 문학사상의 영향 이나 지위논 『장자』에 훨씬 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유명 한 도가서 의 하나인 『열자(列子)』는 서 기 기 원전 400 년경, 공자와 맹자의 중간쯤 되는 시대에 산 열어구(列 禦冠 )의 처 술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사기』에도 그의 전기가 실려 있지 않아 열어구의 생애에 대하여 자세히 알 길이 없다. 『한서』 예문지에 『열 자』 8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 지금 전해지고 있는 『열자j.x.. 8 편이 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연자』에 대하여는 이미 당 • 송대의 여러 학자들이 그 내용을 의십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마서문(馬奴倫)이 Ii'열자위서고(列子僞 書考 )』(天馬山房 縱書 )에서 20 가지 증거를 들어 『열 자』가 가짜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양계초(梁啓超)는 『고서전위급 기년대 (古 書眞 僞及其年代)』에서 지금 『열자』에는 양전(兩晋) 무렵의 불교사상과 불교의 신화까지도 섞여 있으니 그 주(注)를 쓴 장참(張 滿)이 위작한 것이라 단언하기도 하였다. 아직도 이에 대하여는 학 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나 적어도 한(漢)나라 때의 『열자』가 지금 우 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은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제자(諸 子)의 저서 중 『열자』논 문장도 빼어나고 상상이 풍부한 내용이 담 겨 있어 후세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만 여기에서 다물 자 료가되지는 않는다. 〈참고도서〉 『莊子辨解』 1 冊, 朝鮮 韓元震 撰, 1648.
『道德指}帝』 2 卷, 朝鮮 徐命『? 撰, 1969. 『莊子(注譯)』 韓國 金學主, 乙酉文化社, 서 운, 1983. 『老子(注譯)』 韓國 金學主, 明文堂, 서울, 1978. 『列子(注譯)』 韓國 金學主, 明文堂, 서울, 1977. 『莊子注』 10 卷, 晋 郭象 撰. 『莊子音義』 3 卷, 唐 陸德明 撰. 『南華偵經注疏』 35 卷, 唐 成元英 撰. 『莊子 口 義』 10 卷, 宋 林希逸 撰. 『南華眞經義海篠微』 106 卷, 宋 猪伯秀 撰. 『莊子深』 8 卷, 明 魚站 撰. 『莊子媒解』 8 卷, 淸 王先謙 撰. 『莊子i밍澤』 10 卷, 淸 郭戱藩 撰. 『莊子纂築』 民國 錢穆 撰, 東南印務出版社, 香港, 1951 . 『老子道德經注』 2 卷, 晋 王弼 撰. 『列子注』 8 卷, 晋 張世 撰. Tao Te Chin g & The Writ ing s of Chuang - Tzu, Jam es Legg e , Rep r in t , Ch'eng Wen Publis h in g Co., Taip e i, 1976. Chuang Tzu, Yu-I a n Fung , Repr in t , Parag o n, New York, 1964. Three Way s of Thoug h t in Anc ien t Chin a , Arthu r Waley, Doubleday, Anchor Books, Garden Cit y, N.Y., 1956. The Comp le te Works of Chuang Tzu, Burto n Wats o n, Columbia Uni- versit y Press, New York, 1968. Tao Te Chin g : The Book of the Way and It' s Vir tue , J.J.L. Duy v en-dak, Jo hn Murray, London, 1954. Tao Te Chin g , D.C. Lan, Peng uin, London, 1963.
5. 『순자(荀子)』 『순자』는 다자』에 뒤이어 전국시대에 나온 유가의 대표적인 저 서이다. 송(宋)대에 주회(朱熹)가 맹자를 유가의 정통을 계승한 학 자로 내세우기 이전까지는 학계에서 순자는 맹자와 대등한 유학의 계승자로 중시하였었다. 오히려 유가 경전의 연구와 전승에 있어서 논 순자가 맹자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71) 『사 기』 맹자순정열전(孟子荀卿列傳)에 그에 관한 전기가 실려 있는데, 순자(荀子, B.C.298?~B.C.238?)72) 는 이름이 항(況), 자가 경 g O!) 이 며 , 한(漢)대에는 손경 (孫卿 )73) 이라고 흔히 불렀다. 순자는 조(趙. 지금의 山西)나라 사람이지만 제(齊)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였고 초 (楚)나라에 가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도(世道)를 바로 잡기 위하여 수만언(數萬 言 )의 글을 썼다 한다. 그는 전국시대 말영의 사상가답게 공자나 맹자보다도 현실적인 경향이 짙다. 공 자와 맹자는 그들의 도덕의 바탕으로 〈하늘(天)〉울 신앙하고 있는 데 비하여, 순자는 〈하늘〉이란 자연의 일부여서 사람과는 별개의 것이 라 하였 다. 그리 고 맹 자의 〈성 선선(性 善說)〉 과는 반대 의 〈성 악설 (性 惡說)〉울 주장하고, 따라서 사람의 본성 을 올바로 다스털 〈예 (禮)〉 와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정치나 사회에 대하여도 이상론(理想 論)만울 고집하지 않고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방 법을 늘 내세웠다. 이것은 맹자가 열정적이며 숭고한 사상을 내세 웠던 것과는 달리 순자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71) 注中의 『荀卿子通 論』 의 考證에 의 하떤 『毛詩』 • 『魯詩』 • 『韓詩』를 비 못하여 , 『左 傳』 • Ii'穀梁傳.!] 및 『大戴 禮』 • 『小戴 禮 』의 傳承이 모두 荀子에 게 連結되 고 있다.
72) 注中 『荀卿子年表』 依撮
73) 漢 宣帝의 이름 拘을 諱하여 『孫』이라 하였다는 이도 있고, 음이 비숫하여 通用 되었다고도 한다.
『순자』는 『한서 』 예 문지 유가(儒 家 ) 속에 『손경 자(孫卿子)』 33 편과 부가(賊家) 속에 『손경부(孫卿試)』 10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뒤의 『수 서 (隋書)』와 『당서 (唐 書 )』에 는 또 『손경 자』 12 권과 · 『순항집 (荀況渠)』
1 권 또는 2 권 , 『양경 주순자(楊係注荀子)』 20 권 둥이 수록되 어 있 다. 74) 이것을· 보아도 『순자』의 판본은 역대로 큰 혼란이 있었음을 알 것 이 다. 75) 유향(劉向, B.C.77~ B. C.6) 은 『교수중손경 서 록(校誰中孫卿耆 錄)』에 서 「 322 편을 교정 하여 중복되 는 290 편을 제 외 하고 323 민으로 정리하였다」 했으니, 유향이 편정(編定)한 『순자』가 지금 전하는 『순자』의 바탕이 되었음엔 의십할 여지가 없다.
74) 漢代 以來로 『荀卿子』 • 『孫卿子』로 불리 다가 宋代 이 후부터 『荀子』로 冊名이 落 着된 듯하다.
75) 唐 楊僚도 『荀子注』 序에서 「獨荀子未有注解, 亦復編簡閑脫, 傳寫誤諺, 難好事 者時亦覽之, 至於文義不通, 膜俺卷焉.」이라하여 그 內容의 混亂울 指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 양경 (楊{京)이 『순자주(荀子注)』를 쓰면서 대 략(大略) 편의 편목(篇目)아래에 「이 편은 대체로 제자들이 순경 (荀卿)의 말 울 잡록(雜錄)한 것 」이 라 주를 달았고, 유좌(有坐)편 편목 아태 에 도 「이 이하는 모두 순경과 제자들이 기전잡사(記傳雜市)를 인용해 놓 온 것 」이 라 하였고, 요문(堯問)편 끝머 리 에 서 도 「爲說者 이 하는 순경 의 제자들 말이다」고 주를 달고 있다. 호적(胡適)이 지적했듯이 76) 『한서 』 예 문지 에 『순자』 33 편과 순자의 〈부〉 10 편이 수록되 어 있 는 데 , 지금 우리에겐 32 편의 『순자』(〈부〉 5 편도 그 속에 포항)가 전 해지고 있으니 후세 사람들의 손질이 가해전 것임이 룰림없다. 『순 자』의 체제 ·문장·내용 둥도 각 편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이 순수한 순자의 글로 이루어전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곧 여기에는 순자의 제자들의 굳이 섞여 있는가 하면 후 세 사람들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주워모아 엮어 놓은 부분까지도 있는 듯하다. 장서당(張西堂)은 『순자권학편원사(荀子勸學篇究詞)』란 굴 7” 에서 1) 권학(勸學) • 수신(修身) • 불구(不荀) • 비십이자(非十二 子) • 왕제 (王制) • 부국(富國) • 왕패 (王覇) • 천론(天論) • 정 론(正論) • 예 론(禮論) :각론(樂 論) • 해 페 (解薇) • 정 명 (正名) • 성 악(性惡)의 143 던 온 간혹 착간(錢簡)은 있으나 진짜 순자의 굴이며, 2) 영욕여묻辱) • 비 상(非相) • 군도(君道) • 신도(臣道)의 午민은 진짜인듯 하나 간혹 순 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섞여 있고, 3) 유효(儒效)·
76) 胡逆 『中國哲學史大綱』.
77) 『古史辨』 六冊.
의병 ( 議 兵) • 강국(祖 國) 의 세 편은 순자의 제자들이 쓴 굳임이 분명 하고, 4) 중니 (仲尼) • 치사 (致 {土) • 군자(君子)의 세 편은 그의 제자 들의 글인듯 하나 그 사상이나 문장 표현 이 매우 의십스런 접둘이 있으며 . 5) 성 상(成相) • 부 (但t)의 두 편은 유가인 순자와는 관계 없는 글이고, 6) 대략(大略) 아하의 6 편은· 한( 溪) 대의 유학자들이 여러가 지 기록을 잡록(雜錄)한 것이라 하였다 .7 8) 확실한 고증이라 믿을수 는 없다 하더라도 참고할 만한 주장이다. 다만 한( 漢) 대 사람이 모 아놓은글이라하더라도순자나그의 문인들의 이론을근거로했을 것이기 때문에 순자와 전혀 관계없는 글이라 보는 것은 위험하다. 한대 의 유향(劉向)이 322 편의 『손경 서 (孫卿합)』를 바탕으로 32 편의 『순자』를 편정(篇定)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78) 楊笛如는 『關於荀子本 書 的考證』에서 富國 • 天 論 • 正論 • 禮論 • 解i!li: • 正名 • 性惡 等編에는 진짜 成分이 比紋的 많이 있고, 成相篇 以下 八篇온 荀子와 無關한 굳이 라하였다.
『순자』는 문장에 있어서도 냉정하고 현실적이어서 화려한 수식이 나 교묘한 표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실용적인 떤울 숭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논설문은 『순자』를 통하여 다시 한 단계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7--[ 편의 편제 (編題)가 내용의 주제 (主題)와 합치하고, 대화의 수법을 벌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격적인 논설울 전개하고 있는 접은 앞의 『묵자』의 경우나 같다. 그 러 나 『순자』는 『묵자』와 같은 서 민적 인 감각에 서 가 아니 라 착실한 학자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사상이나 주장을 〈 의식적으로 뚜릿하게〉 표현하려는 기색이 질게 드러나고 있다. 그 대문에 문장은 논리가 정연하고 그의 주장이 뚜렷이 드러나며, 전체적인 구성도 빈 톰이 없이 짜여져 있고 중접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기도 잘 한다. 이런 중 후( 重厚 )한 성 격 때 문에 옛 글에 혼히 보이 는 것 같은 고사(故 事) 의 인용은 적고 대신 필요할 적에는 Ii'시경』 • Ii'서경』 같은 경전율 인용 하여 는거로 상고 있다. 이처럼 성실한 본격적인 논설문은 『순자』 에게서 처음 발견되는 것이며, 후세 논설문에의 영향도 매우 컸던 것 이 다. 특히 『순자』의 천론(天論) • 성 악(性惡) 같은 편은 중국의 고 대 문장 중에서도 가장 조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굳이라 할
것이다. 보기를 든다. 하늘의 운행(運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요(吳)임금 대문에 존재하 지도 않거니와 질(架)왕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다스림으로써 거기 에 대웅하면 곧 길(吉)하고, 혼란으로써 거기에 대응하면 곧홍(凶)하다. 근본적인 일(농사 같은)에 힘쓰면서 쓰는 것을 절약하면 곧 하늘은 가난 하게 할 수 없고, 양생(義生)에 대비하면서 대에 알맞게 움직이면 곧 하 늘은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올바론 도를 닦아 이를 어기지 않으면 곧 하 늘은 화난을 당하게 할 수 없 다. 그러 므로 장마와 가뭄도 그러 한 사람을 굶주리고 목마르게 할 수 없으며, 추위와 더위도 그러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요괴 (妖怪)도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일(농사 같은)은 버려두고 쓰는 것만 사치스럽게 하면 곧 하 눈은 그를 부하게 할 수가 없으며, 양생을 소홀히하고 벌로 움칙이지 않 는다면 곧 하늘은 그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으며, 올바론 도를 어기고함 부로 행동하면 하늘은 그를 길(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 람은 장마와 가뭄이 닥치기도 전에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가 엄습하기도 전에 병이 나며, 요괴가 나타나기도 전에 불행하게 된다. 타고 나는 시대는 평화롭던 세상과 같은데도 재앙과 · 재난은 평화롭던 세상과는 달리 많아도,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들의 행동 방 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밝으. 떤 곧 그를 지극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天行有常. 不爲堯存, 不第架亡. 應之以治則吉, 應之以亂 R lj凶. 强本而節 用,則天不能貧;義備而動時, 則天不能病;修道而不武, 則天不能禍. 故水 早不能使之凱混 寒暑不能使之疾, 妖怪不能使之凶. 本荒而用(ff,, 則天不能使之富 ; 迷略而動卒, 則天不能使之全 ; 倍道而妄 行, 則天不能使之吉. 故水早未至而g l, 寒暑未薄而疾, 沃怪未至而凶. 受時與治世同, 而殊禍與治世異, 不可以怨天, 其道然也. 故明於天人之 分, 則可謂至人矣. 〔天論) 과학자와 같은 냉철한 사고와 그것을 표현한 정연한 논리가 느껴지 는 굳이 다. 유가의 경 전인 『예 기 (禮記)』 중에 는 『순자』 중의 상당한 분량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이처럼 『순자』의 굳이 뒤에 Ii'오경(五
經)』 중의 일부분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자가 예 (禮)를 중시 했었다는 사상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특출한 그의 문장에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문학사상 『순자』에 있어 중시해야 할 접은 성상(成相)과 부()6)1;) 두 편 속에 실려 있는 글일 것이다. 성상편은 민간가요의 형석 79) 을 빌어 자신의 정치사상을 노래한 것으로, 이전에 『시경』이 있었다해 도 가요체시(歌降體詩)의 첫 작품이라 할 것이다. 『한서』 예문지에 도 잡부(雜齡 속에 『성상잡사(成相雜辭)』 11 편이 들어 있는데 같은 계열의 시가인듯 하다. 성상편의 문장 자체는 별것이 아니타 하더 라도 민간가요에서 새로운 문체를 개발했다는 접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문장의 귀철이 삼언(三言)과 사언(四言)으로 이 루어지고 미교적 자유로이 압운(押韻)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은 한 (漢)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가(詩歌)를 발전시키는 터전이 되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서』 예문지를 보연 〈성상〉을 〈부〉 계 열의 운문으로 보고 있으니 한부(漢試)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보기로 중간에서 삼절(節)을 들어 본다,
79) 淸 兪越이 民「내에서 철구질을 할 때 부르던 노태가 〈相〉이며, 〈成相〉은 〈相가락 올爲注 이) 문다〉는 뜻이타 풀이하였고, 王先謙도 이에 殿同하고 있다.(『荀子染解』 成相
물은 지극히 평평하여 단정하면서도 기울어지지 않는데, 마음 쓰임이 이와 같으면 성인처럼 되리라. 사람으로서 권제 지니고 자신은 곧고 납을 이끌어 주면 반드시 그의 공 하늘의 변화에 합치되리라. 세상에 왕자 없으면 현명하고 훌륭한 아들 꿍해지고, 난폭한 자들 소 돼 지 고기 먹 고 어전 이들 술지게미와 겨 먹으며, 예의 음악은 믿철되고
성인은 숨어버리고 묵자(墨子)의 술법 행해지리라. 다스립의 중십은 예의와 형법일세. 군자는 이를 닦고 백성을 평안케 한다네. 덕 밝히고 형벌 신중히 하면 국가도 다스려지려니와 온 세상 평화로와지리라. 水至平, 端不傾. 心術如此, 象聖人. 人而有執, 直而用推, 必參天. 世無主, 窮賢良 ; 暴人腐徐, 仁人精糖 ; 禮樂滅息, 聖人隱伏, 墨術行. 治之經,禮與刑. 君子以條, 百姓寧. 明德愼罰, 國家槪治, 四海平. 〈부〉편에 는 예 의 (禮) • 지 혜 (知) • 구름(雲) • 누에 (蠶) • 바늘 @E) 을 읊은 다섯 편과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실상을 노태한 퀘시 (俺詩)가 한 편 들어 있다. 이는 『한서』 예문지에 실린 『손경부(孫卿 I 試)』 10 편 중의 일부가 전해 전 것 일 것 이 다. 순자의 부頂t)는 한부 (漢賊)와는 반대로 문장이 소박하고 내용은 건실하다. 그리고 제목 은 구름 • 누에 • 바늘 둥의 물건을 읊은 듯하면서도 실은 그와 관련 된 이치를 논술한 운문이다. 이들 〈부〉는 모두 수수께기식으로, 각 각 그 물건의 특칭과 원리를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 그 물건의 원 리를 풀며 그 물건을 알아맞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문재의 제기 부분은 4 연(言)이 중십을 이루는 운문이고, 해답 부분은 산문식으 로 변화있는 문장이나 모두 비교적 자유롭게 압운(押韻)하고 있다. 퀘시(俺詩)도 사언이 중십을 이루고는 있지만 또 저지 않은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보기로 구름을 읊은 부분을 읽어보기로 한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직엔 맥맥하고 고요히 아태로 깔리고 움칙이면 높이 솟아오르며 거대해진다.
둥근 것에도 곽 차고 모난 것에도 곽 차며, 위대하기 하늘과 땅 비슷하고 .:z. 덕은 요(堯)임금 우(禹)임금보다 두텁 다. 정미(精 徽 )하기 가는 터럭과 같고 크기 는 우주에 가득 찰 만하다. 갑자기 끝 없이 멀리 가기도 하고 갈라져서는 서로 뒤쫓으며 되돌아오기도 한다. 까마득히 높이 있기만 하면 온 천하가 곤경에 빠지지만, 그 덕은 후박하여 만물을 버리지 않고, 오채(五彩)를 갖추고서 무늬를 이루기도 한다. 왔다 갔다 날을 어둡게도 하는데 .:z. 위대한 변화는 헤아릴 길이 없다. 둘락날락 매우 바쁘지만 그것이 나오는 곳은 알 수 없다. 천하는 그것이 없으면 멀망하고 그것이 있어야 촌속된다. 재자(弟子)는 불민하나 이에 대하여 알기 원하니 선생님께선 해선율 하시어 그 뜻을 헤아려 주소서. 그것은 크면서도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주에 가득 차면서도 빈 톰이 없고 듬바구니와 구멍으로 들어가도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멀리 빠른 속도로 가지만 소식 전할 것을 부락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왔다갔다하며 만물을 가리 지 만 꽉 막을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는가? 사나운 우뢰 로 만물을 살상하지 만 예측하거나 꺼릴 수도 없는 게 아니겠는가? 공로는 천하에 두루 미치게 하지만 사사로이 치우치는 곳은 없는 게 아니겠는가?
땅에 의 탁하여 우주에 노닐며 바람을 벗 삼고 비를 자식 상으며, 겨울엔 추위를 몰아오고 여름앤 더위몰 몰아오는 헤아릴 수 없이 정묘하고 신령스런 것이니, 〈구름〉으로 귀 착되 는 수밖에 없구나 ! 有物於此, 居貝lj}처靜致下, 動_R l j蒸高以距 ; 圓者中規. 方者中短 ; 大參天 地, 德厚堯禹 精徽平墓毛, 而大盆平大寫. 忽分其極之遠也, 操分其相逐 于而反大也神. ; 卯出卯入莊分極天,下 之莫咸知斑其也 r,, ;德 天厚下而失不之損 R, lj 滅,五 采得之備f而l 成l j存文. . 往來悟態, 通 弟子不敏,此之願陳, 君子設辭, t肖測意之. 曰 ; 此夫大而不器者與 ? 充盆大宇而不苑, 入邸穴而不個者與 ? 行遠疾 速而不可託凱者與 ? 往來悟態而不可爲固塞者與 ? 墓至殺傷而不{g,思者 與 ? 功被天下而不私避者與 ? 託地而游宇, 友風而子雨 ; 冬 日 作寒, 夏 日 作署 ; 廣大精神, 請歸之雲. 〔 雲 J 이논 전에 없던 새로운 문체이며, 정치나 이해(利害) 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문장 처작의 시도라 보아야 할 것아다. 초(楚)나라에 순자 에 앞서 『초사(楚辭)』를 지은 굴원(屈原, B.C.343~B.C.290?)80) 이 있 었다 하나, 그의 생애가 전설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대 이전에는 그러한 작품이 읽혔다는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순자』의 성상편 ·부편은 중국문학사상 중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뒤 에 한부(漢試)가 발전하였고, 또 독자로서 왕후(王侯)와 귀 족만을 의식하지 않는 개성적인 문장이 중국에 발전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곧 『순자』의 내용은 그 성분이 잡다하기논 하지만 문학떤에서 볼 때 중국의 논설문을 완전히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시가(詩歌)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체(詩陵) 와 개성적인 창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 陸 1 1il.如 『屈原잡뱅i.ll 및 『中國詩史』 卷上 依賊.
〈참고도서〉 『荀子(注譯)』 韓國 金學主, 大洋합籍(『世界思想全菜』), 서 울, 1969. 『荀子注』 20 卷, 唐 楊依 撰. 『荀子築釋』 20 卷, 淸 謝堀 撰. 『荀子補注』 1 卷, 淸 那懿行 撰. 『荀子通義』 4 卷, 詩說 1 卷, 淸 兪避 撰. 『荀子渠解』 20 卷, 淸 王先謙 撰. 『荀子簡釋』 民國 梁啓雄, 商務印찹館.
6. 『한비자(韓非子)』 『한비 자』는 법 가(法 家)를 대 표하는 한비 (韓非, B.C.280 ? ~B.C. 233 ?)81) 의 처서이다. 그는 한(韓)나라 제후의 아들로 뒤에 진( 秦) 나라 재상으로 활약한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荀子)를 사사(師 事) 하였다 한다. 『사기』 노장선한열전(老莊申 韓 列傳)에는 .:z..의 전기가 실려 있 는데, 술수(術數)를 주장했던 그였지만결국 찬구인 이사(李斯)의 모 함으로 전( 秦) 나라에 와서 죽고 만다. 그리고 한비는 한나라의 국세 가 날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서 부국강병책을 건의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옛날 정치의 득실(得失)과 변화를 살피어 십여만언 (十餘菓言)의 책 을 지 었다 한다•
81) 梁啓超 『先秦學術年表』 依擬.
한비는 유가와 도가 • 묵가의 사상을 모두 공부한 위에 이를 비판 척으로 흡수하고(특히 순자와 노자의 사상을 많이 취했다), 그보다 앞선 법가 계열의 오기( 吳起) 와 상앙(商 ¥央) 이 주장하던 〈법〉에 의한 다스립, 신불해(申不 害 )가내세우던 〈술(術)〉을 이용한 다스립, 신도 (愼到)가 역설한 〈세(勢)〉에 의한 다스림 둥의 아론을 종합하여 그 자신의 형 명 (形名)과 법 술(法術)의 학문적 이 론 체 계 를 완성 하였 다. 유가나도가 • 묵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백성들의 입장도 반영하 려고 노력하였으나, 법가는 백성보다도 통치자의 입장에서 정치론 을 펴고 있다. 한편 법가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정(鄭)나라의 자산 (子産)과 신불해 • 한비 가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인데 (한나라가 정 나라 를 멸망시켜 통합하였음), 동주(東周)시대에는 특히 정나라 사회가 가장 큰 변화를 겪어 새로이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상인과 지주 둘이 생겨났으므로, 이들의 이여울 대표하는 학문으로 법가가 발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비 의 사상은 기 본적 으로 〈법 치 (法治)〉와 〈술치 (術治)〉의 두가지 로 요악할 수 있다. 〈법〉이란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규칙 을 뜻하고, 〈술〉이란 통치자가 권제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다루는 방법 을 뜻한다• 그러 기 에 그는 업 형 여웃刑)과 중법 (重法)을 강조하는
한편, 임금이 신하에게 본 마 음을 내보여서 는 안된다는 무위술(無爲 術) , 신하의 이론과 행동이 부합되는가를 마지는형명술(形名 術) , 남 의 말만듣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참오술(參正術), 신하들 의 의견을 듣는 방법인 청연술(聽 言 術) ,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인 용 인술(用人術) 같은 술책을 도처에서 논하고 있다. 이것은 순자의 역 사적인 인식과 현실적인 사상 및 성악론(性 惡論)을 계승한 위에 노 자의 도술(道術)을 법 술에 응용하여 완성 시 킨 것 이 다. 『한서 』 예 문지 에 는 1i'한자(韓子)』 55 편이 수록되 어 있고, 『수서 (隋 함) 』 경적지(經 籍志 )에는 『한자』 20 권, 목(目) 1 권이 수록되어 있 는데, 지금 전하는 『한비자』도 20 권 55 편이니 대체로 한대의 판본 과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다만 책이름은 본시 Ii'한자』라 불렀었으 나 송(宋)나라 때부터 학자들이 당(唐)대의 고문가(古文 家) 인 한유 (韓急)를 〈한자〉라 부르게 되 면서 혼동을 피 하기 위 하여 이 를 『한비 자』라 바꾸어 부르게 된 것이다. 『한비자』는 이미 한비의 생전에도 퍽 널리 읽혀졌던 듯하다. Ii'사 기』를 보면 진시황은 한비의 글 고분편(孤償篇)과 오두편(五 鉉篇) 윤 읽고 · 크게 감동하였다 하였고, 한비가 죽은 뒤엔 이사(李斯 ) 와전이 세 (秦二世)가 모두 그들의 글에 『한비 자』를 자주 인용하였 다. 82) 사 마천(司馬遷)은 Ii'사기』에 한비의 전기를 쓰면서 세난(說難) 편을 수 록하고 「한비 는 과거 정치 의 득실(得失)과 변화를 살피 어 고분(孤愼) • 오두(五蠶) • 내외저(內外緖) • A길 림(說林) ·세난 (說難) 등 십여만언 (十餘萬言)을 지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보인 편명은 모두 지금 전 하는 『한비자』 속에 들어 있으니 대체로 『한비자』는 한바가 지은 것이라 보아도 큰 찰못은 없을 것이다. Ii'사고전서총목제요(四 庫全書 總目提要)』의 해설에 의하면 원(元)나라 지원(至元) 3 년 (1337) 에 냐 온 하번본(何祚本)은 53 편이 었는데 간검 (奈助)편과 설립 (說林) 하편 의 일부가 없어진 것이었다 한다. 그리고 옛 책에 인용된 『한비자』 의 굳 중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Ii'한비자』에는 들어 있지 않은 글들 도 꽤 있으니, Ii'한비자』의 내용에도 전승되어 오는 동안 혼란이 져
82) 『史記』 李斯傳 및 秦本紀 참조 .
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고 형 ( 高亨) 은 『 한비자보전 (韓非子규睦 5) 』 서 문 에 서 『한비 자』 중의 초 현전 ( 初 見秦) • 존한 (存 韓) • 난언( 難言 ) • 애 신 (愛臣 ) • 유도 (有度) • 식 사 (fii邪) 의 여 섯 편은 모두 한비 가 직 접 쓴 것이 아니라 후 세에 『 한비자』 를 편집한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라 하 며 그 중거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83) 이 여섯 편은 또 완전히 그의 제자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전 것, 그의 제자나 후세 사람들의 손질 이 가해전 것 등 성질이 서로 다를 것이다.
83) 特히 앞머리의 初見 秦 • 1 f# P 의 두 편은 그 아의에도 많은 學者둘이 韓非가 쓴 것이 아님을 主張하고 있다.
『 한비 자』의 글은 대 부분이 본격 적 인 논설문으로서 , 비 교적 길고 논리와 뜻의 표현에도충실하면서도우미( 後美 )함도지니고 있다. 이 전의 『묵자』나 『맹자 』 , 『순자』의 수법을 모두 종합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엄하고도모가 나며 분명하고도 날카로운느낌을 그의 굳에 서 받게 되는 것은 법과 형벌을 강조하는 굴의 내용과 빈름없고 예리한 논리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십리와 논리에 대하여도 깊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통치자들의 어떤 말에 대한 반응을 정확 히 파악하며 그 때의 일과 정황을 빠침없이 분석하여 거기에 알맞 은 시비를 따지며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문장은 분 명하고 힘이 있으며 깨끗하고 반듬없이 짜여쳐 있고, 변술며 후術 )에 대 하여 도 연구를 하여 84) 그의 굳이 화사하지 는 않지 만 수사(辭 修 )에 도 소홀하지는 않다. 오두(五 蟲) 편에서 한 대목을 보기로 돈다. 요( 堯 ) 입금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적에는 궁전인 초가 지붕 추녀도 가지런히 자르지 않고, 참나무 서까래는 끝을 다듬지도 못했으며, 거찬 곡식 밥을 먹고 명아주와 콩잎 국을 마셨으며, 겨울철에는 새끼 사슴 갖 옷을 걸치고 여름철에는 침 베 옷을 걸쳤었다. 비록 문지기의 생활이타하 더라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禹)입금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적에는 몸소 쟁기와 가태를 들고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넓적다리에는 살이 없었고 정강이에는 털이 날 겨 를이 없었다. 비록 노예의 수고로움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84) 例로 說 難篇 갈은 것.
이로써 말한다면 옛날에 천자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곧 문지기의 생 활을 버리고 노예의 수고로움을 떠나는 셉인 것이다. 옛날에 천하를 물 려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게 못되었다. 지금의 현령(縣令)들은 어느 날 자신이 죽어버란다 하더라도 자손들은 대를 이어 수레를 몰고 다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것울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천자 자리는 가벼이 떠날 수 있지만 지금의 현령 자리는 떠나기 어려운데 이것은 박하고 후한 설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 속에 살면서 골짜기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은 이월달 누제(腦祭) 나 섣달 납제예彬祭) 때에도 서로 물을 주고 받지만, 택지(澤地)에 살며 물 때 문에 고생 하는 사람들은 일꾼을 사서 도랑을 튼다. 그래 서 흉년이 돈 해 봄이면 어린 아우까지도 밥을 덕여주려 들지 않지만 , 풍년이 돈 해 가을 에는 관계없는 나그네에게까지도 반드시 밥대접을 하려 돈다. 그것은 골 육을 멀리 하고 지나는 나그네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자가 많고 적 온 데 따른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堯之王天下也, 有茅茨不 a i, 采祿不新, 機菜之食, 黎滋之英, 冬 日 鹿装, 夏 日 葛衣. 難監門之服投, 不炳於此矣. 禹之王天下也, 身執未爭, 以爲民先, )股無股, )匠不生毛. 難臣肉之勞, 不苦於此矣. 以是言之, 夫古之讓天下者, 是去監門之義, 而離臣限之勞也. 古傳天下, 而不足多也. 今之縣令, 一 日身死, 子孫累世紫篤, 故人重之. 是以人之於讓也, 輕辭 古之天子, 難去今之縣令者, 薄厚之質異也. 夫山居而谷淡者, 膜臘而相造以水, 澤居苦水者, 買庸而決災. 故磯歲之 春, 幼弟不(B(, 銀歲之秋, 疏客必食. 非疏骨肉愛過客也, 多少之質異也. 문제의 설명이 철처하고 논거가 확실할 분만 아니타 기지와 해학 조차도 넘쳐흐르고 있다. 그리고 문장의 논리가 정연하고 짜임새도 빈룹이 없다. 이러한 『한비자』의 논설문은 대략 다음과 같은 네가 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 해석식 (解釋式)으로 해로(解老) • 난언 (難言) • 세 난(說難) • 팔간(八好) • 십 과(十過) • 망칭 (亡徵) 같은 편 의 굳이 이 에 속한다. 둘째 ; 연역 식 (演釋式)으로 주도(主道) • 유도
(有度) • 제 분(制分) • 고분(孤債) • 팔설 (八說) • 현학여願尙 같은 편의 굳이 이에 속한다. 세째 ; 귀 납식 (歸納式)으로 내처설상(內偉說上) • 의 처 설좌상(外個說左上) • 의 처 설좌하(外偉說左下) • 의 저 설우상
를 군자둘에게 산 것이 된다. 또 창 고 운 열 어 가난한 사람들에 게 곡식을 나누어 준 것온 공 없는 사람 들에게 상울 내린 셉아 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심사하여 풀 어주거나 조 ] 윤 가벼이 해 준 것은 곧 잘못을 처벌치 않은 셈이 된다. 공 없 는 사 람들에게 상을 주면 백성들은 구차히 요행을 바라면서 임금이 관운 잃기 바라게 된다 . 잘못운 처벌하지 않으면 곧 백 성들은 겅계할 줄을 모르고 그 릇 된 짓을 하기 쉽게 된다. 이것은 혼란의 근본이다. 어찌 수치 를 씻을 수가 있겠는가?」 齊桓公飮酒 , 醉迫其冠, 恥之三日不朝.管仲曰;此非有國之恥也. 公胡其 不 雪 之以政 ? 公曰 ; 善 . 因發倉困賜貧窮, 論圈固出薄罪 . 處三 日 而民 歌之 曰;公平公平, 胡不復追 其 冠平? 或曰;管仲 雪桓 公之恥於小人, 而生桓公之恥於 君 子矣. 使桓公發倉困,而 賜貧窮 論 圈圓, 而出薄罪, 非義也, 不可以 雪 恥, 使之而義也. 桓公宿義, 須造冠而後行之, 則是桓公行 義非 , 爲造冠 也. 是難雪造冠之恥於小人, 而 亦造義之恥於君子矣. 旦夫 發困倉 , 而賜貧窮者, 是賞無功也 ; 論圈固 , 而 出薄罪者, 是不珠過也. 夫賞無功, 則民倫幸而望於上 ; 不株過, Jllj民不忽 而易爲非. 此亂之本也. 安可以 雪 恥哉! 『한비 자』에 는 또 논증을 위 하여 많은 고사(故事)와 우언(萬言)을 동원하고 있다. 〈우언〉의 활용은『장자』만큼철저하지는 않지만, 얘 기의 구성이 생동하고 내용이 다채로우면서도 짜임새가 있어 문학 적 인 성 향이 두드러 진다. 곧 『한비 자』의 〈고사〉와 〈우언〉에 는 톡벨 한 풍취와 날카로운 풍자에다 풍부한 상상력까지 담기어 있는 것이 다. 이것은 한비의 문장이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서술에도 뛰어났 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 『한비자』의 문장 중에서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것 온 노자의 사상과 관계 있는 부분이다. 『한비자』에는 『노자』와 노 자의 사상을 해 설한 해로(解老)와 유로(兪老)의 두 편이 있고, 또 노 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주도(主道)와 양각(揚確)의 두 편이 있 다. 이들 Ii'노자』와 관계 있는 부분의 문장은 많은 부분 운(韻)을 밟고 있고 고색(古色)을 띠어 깊은·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앞의 두 편은 『노자討응 해설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체
를 마음껏 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뒤의 두 편의 글에서는 『한비자』 에서 개발된 또 다른 수준 높은 문체를 발견하게 된다. 주도편의 굳 온 구형 (句形)에 변화가 많으면서 도 압운(押韻)을 하고 있고 대 부분 대구(對句)로 이루어져 있다. 후세의 변문(멈t文)에 아주 가까운 굳이 라 할 것 이 다. 양각편의 굳은 거 의 가 4 언( 言 )으로 된 운어 (韻語)로 이 루어져 있어 더욱 정제한 운문에 가까와쳐 있다. 자신의 법술(法術) 에 철학적인 도론(道論)을 끌어들이다 보니 이처럼 함축적이고도 미 묘한 운문에 가까운 글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래에 그 보기 를 각각 한 대목씩 돈다. 도(道)란 만물의 시작이며 시비(是非)의 기준인 것이다. 그러므로 명 철한 임금은, 시작을 지킵으로써 만물의 근원을 알며, 기준을 다스립으. 로써 착함과 잘못됨의 발단(發端)을 안다. 그러므로 허정(虛靜)함으로써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데, 명칭에 관한 명령은· 스스로 내려지게 되고, 일 에 관한 명령은 스스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허(症)하면 실지 사정을 알게 되며, 정(靜)하면 움직임의 올바름을 알게 된다. 말이 있는 자는스 스로 명칭을 만들게 되며, 일이 있는 자는 스스로 형식을 만들게 되는데, 형식과 명칭이 서로 어울려야만 입금은 곧 무사하게 되고, 그 참됨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되니, 임금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 신하들이 자연히 걸치레로 아 첨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은 그의 뜻을 드러내 보여서는 안되니, 임금이 그의 뜻을 드러내 보이면 신하들이 자연히 툭벌히 찰 보이려 들게 되는 것이다. 善0道敗0者之0,0端 萬 0物故0之處0始靜0,以 待是0令非00, 之0 紀0令也00名•0 自 0命是0也以0,明 君令,0 事0自守00定始00也以00, 知0 萬0虛0物則00之知00源實00,之 0 情0,治0 紀00以1@0知Jll j 知O 動O 之O正 0. 有O 言O 者O 自O爲 O名 0, 有O 事o 者O 自O 爲O 形0 ; 形名參同0, 君乃無事焉, 歸之其 情0 故曰 ; 君無見其所欲0, 君見其所欲0, 臣將自離抵0. 君無見其意0, 君見其 意0 臣將自表異0. 〔主道〕 86) 하늘에 대명(大命)이 있고 사람에게도대명이 있다. 향긋하고 맛있는 좋은 술과 살찐 고기는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으며, 아름다 86) o 標논 對句 표시 , @標는 韻字.
운 살갖과 흰 이의 미녀는 감정율 기쁘게 하지만 정력을 손상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십한 것을 버리고 지나친 것을 그만두면 몸에는 곧해가 없 게 될 것이다. 권세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니 본시 무위(無爲)한 것이기 때문이 다. 일은 사방에 있지만 권요(權要)는 중앙에 있다. 성인은 권요를 잡고 있어 사방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게 되는 것이다. 허(虛)함으로써 대하면 그는 스스로 일하게 된다. 온 세상이 숨기어져 있으되 음(陰)을 동하여 양(陽)올 보게 된다. 좌우에 일할 사람윤 세웠으면 문을 열고 맞아들여 야 한다. 변화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행하되 끊임없이 행하는 것 이것을 이치를 실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天0有0大0命0, 人0有0大0命0. 夫香美腕味0, 厚0酒0肥0肉0, 甘0口0而0病00形 ; 壘0理0皓0齒0, 說0權情0不而0欲0損見0精, 素故無去爲其也去.泰0, 事 0 在身0 四乃0方 無0, 害 0. 要 0 在0 中0 央0 ; 聖0 人0 執0要 0, 四0 方0 來0效 0. 읊命 待0 之0, 彼0 自0 以0 之0. 四海經藏0, 道陰見陽0 ; 左右競立, 開門而當0. 勿못勿易, 與二供行0 ; 行之不已0, 是謂履理0也 . [揚摘〕 Ii'한비자』는 대체로 앞의 〈기사(紀 事 )의 굳〉 중의 『전국책』과 비슷 한 시대의 글인듯 하다. 이 두 책에는 여러가지 같은 얘기들이 기 록되어 있을 분만이 아니라 문장도 한자로 이물 수 있는 완성된 형 태, 다양하떤서도 우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 이외에도 『한서』 예문지에는 법가(法家)에 『이자(李子)』· Ii'상군(商君)』 • 『신자(申子)』 둥 10 가(家)가 수록되 어 있으나 나머 지 는 모두 전하지 않는다. 지금 Ii'상군서(商君 書 )』가 전해치고 있기는 하나 Ii'순자』보다도 뒤 늦게 전국시 대 말엽 에 위 작(僞作)된 것 임 이 분 명하고, 관중(管仲)이 지었다는 Ii'관자(管子)』도 전해지고 있어 법가 의 책으로 보려는 이가 있으나 이 역시 전국 말연의 저작임이 분명 한 것이다 .8 7) 그 위에 이들은 내용이나 문장 모두 벌 특색도 없는 것듈이다. 87) 梁啓超 『古書眞僞及其年代』 等 참조.
〈참고도서〉 『韓非子(注譯)』 韓國 金學主, 大洋밥籍(『世界思想全渠』), 서 울, 1969. 『韓非子菜解』 20 卷, 消 王先愼 撰. 『韓非子染釋』 民國 陳奇獸 撰, 中華書局. 『韓非子沒解』 民國 梁啓雄 撰, 中華書局. Han Fei Tzu: Basic Wr iting s , Burto n Wats o n, Columbia Univ e rsit y Pre!s, New York, 1964.
7. 『여씨춘 추(呂 氏 春秋 ) 』 『순자』와 『한비 자 』 가 문학적 으로 천하 통일을 준비 하는 처 서 의 성격을 떠었다면, 『여씨 춘 추 』 는 진 (泰 )나라의 천하 동 일을 대표하 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여씨춘추』는 뒤에 전시 황 의 승상 (丞相) 을 지낸 (B.C.249~B.C.23 _ 7) 여불위(呂不 韋 ?~B.C.235 ) 가 전나라가 천하 릎 통일하기 직전에 자기 문하의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처 순 편찬케 한 책 이다. 『여 씨 춘추』는 전체 가 12 기 ( 紀 ) • 8 람( rt ) • 6 론 (論 )으로 이 루어 져 있 는데 , 이는 각각 천(天) • 지 (地) • 인 ( 人)울 대표하는 수자로서 천지 만물과 고금(古今)의 일에 관한 지식을 총괄( 總括 )하겠다는 포부 아 래 세워진 체계이다. 12 기는 사계철을 각각 맹춘(孟 春) • 중춘(仲 春 ) • 계 춘( 季 春)식 으로 나누어 일년울 대 표하도록 짜였으며 , 1 기 는 모 두 5 편으로 다시 나누어 쳐 있는데 끝머 리 계 동기 (季冬紀)에 는 전체 의 서며킹에 해당하는 서의(序意)편이 불어 있어 도합 61 편이다. 8 람 온 또 모두 8 편으로 나누어 쳐 있는데 첫 번째 유시 람 ' (有始 i합 )만은 7 편이어서 도합 63 편이다. 8 은 땅을 대표하는 수자이다. 6 론은 다시 모두 6 편으로나누어져 도합 36 편인데, 6 은사람을대표하는 수자 이다. 이 책의 체계는 이처럼 방대하고 계획적이지만 내용은 그 이 전에 존재했던 여러 학파의 이론을 모아 놓은 것이며, 여러 사람들 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서 체계와 내용은 찰 어울리지 못 한다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정치문제와 관계되는 것아 가장 많은데, 매 편의 철 학적인 관접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전의 학파들의 이론을 모 두수합했다하더라도 역시 유가의 이론이 가장많으며, 다음으로 묵가 • 도가의 순이 고, 또 맹 춘기 (孟 春 紀)의 본생 (本生) • 중기 ( 重 己)편 과 중춘기 (仲春紀)의 귀 생 ( 貴 生)편처 럼 극단적 인 이 기 주의 를 주장한 양주( 楊 朱)의 학설을 대표하는 부분도 있다. 여불위논 학파를 논한 다면 법가에 속할 것이나 법가사상울 대표할 만한 내용은 극히 적 고, 오히려 이속람(離俗覽)의 상덕(上德)편 같은 데에서는 법가의 엄
형(嚴刑) • 중상(重賞)에 의한 정치 방법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이는 법형 (法JT-lj)에 의한 정치를 행하는 전(秦)나라에 있어서도 지식 인들 중에는 이에 찬동하는 이가 극히 적었던 상황울 증명하는 것 인지도 모른다 .88)
88) 그래서 結局온 秦始皇에 의하여 徒판抗儒라는 暴政이 斷行케 되 었을 것이 다.
정 치 론 이 의 에 도 맹 하기 (孟夏紀)의 권학(勸學) • 촌사(尊師) • 무도 (誤徒) • 용중燁衆) 같은 편은 교육과 관계 가 깊은 내 용이 고, 중하 기 (仲夏紀)의 대 악(大樂) • 치 악(移樂) • 적 음(適音) • 고악(古樂) , 계 하 기 (季夏紀)의 음률(音律) • 음초(音初) • 제 악(制樂) • 명 리 (明理) 같은 편은 음악론이 라 할 수 있는 내 용이 고, 맹 추기 (孟秋紀)의 탕병 (范兵) ·전란(振亂) ·금새(禁塞) ·회총(懷龍), 중추기(仲秋紀)의 논위(論威) • 간선(簡選) • 결승(決勝) • 애사(愛士) 등은 병 법 (兵法)에 관계되는 내 용이 며 , 끝머 리 사용론(士容論)의 상농(上裝) • 임 지 (任地) • 변토(辨 土) • 십시(審時)편 둥은 농사에 관한 기록이다. 곧 진나라 동일 이 전의 여러가지 중국인들의 지식이 종합되어 있는 샘이다. 사상분만이 아니라 문장에 있어서도 그 표현 기능은 이전의 문장 둘의 기능을 종합하고 있는 셉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책의 12 기 • 8 람 • 6 략의 체계적 인 편집은 이제껏 나온 다른 전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고의 형식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체재는 곧 『예기(禮記)』 • 『회 남자(淮南子)』 • 『사기 (史記)』 등의 편집에 칙접 영향을 끼쳤고, 육조(六朝)시대에 나온 유서 (類 럽 )인 『수문어 람(修文御覽)』 • 『화림편 략(華林循略)』 같은 책의 편제까지도 『여씨춘추』를본받은것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장중하면서도 아름답고 광박하면서도 막힌 데 가 없다. 글의 조리가 분명할 분만 아니라 앞뒤로 논리가 일관되 어 있어, 이전의 글들보다도 읽기 쉽고 똑똑히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게다가문장의 표현에 기지가번득이는곳이 많고 퀘변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대목까지도 있지만 入김복력이 매우 강하다• 전시황 의 분서 (禁書) 이후로 많은 중국의 전적들이 없어져 버렸으나 이 책 울 동하여 전해지고 있는 유문구설(造聞밟說)들이 적지 않은 것도
『여씨춘추』의 가치믈 높여 준다• 문장의 표현 기능을 동해서 보더 라도 『여씨춘추』는 최초의 자체(字體) 통일을 뜻하는 소전(小錄)의 시대까지도 상칭한다고 말할 수 있울 것이다 . 다음 보기만 읽어 보 아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은 양립(兩立)될 수 없는 것이고, 충성은 아우를 수가 없는 것이 다. 각은 이익을 버리지 않으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작은 충성 을 버리지 않으면 큰 충성을 이루지 못하계 된다. 그러므로 작온 이익은 큰 이익의 해가 되고,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해가 되는 것이어서, 성인 온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였었다• 옛 날에 초(楚)나라 공왕 (OO 王)과 전(晋)나라 여 공(腐公)이 언롱( .i 部陵) 에서 싸워, 초나라 군사가 패하고 공왕이 부상한 일이 있었다. 그때 싸 움을 앞두고 초(楚)나라 장군 자반(子反)이 목이 말타 마설 것 을 가져 오 도록 하였다. 수하의 양곡(陽穀)이 술동에 술을 갖다 바치자, 자반은 「안 마 술은 물려라 !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양곡이 「술이 아닙니다」하자, 자반은 「빨리 물려 라 ! 」하고 말하였으나, 양곡은 또 「술이 아닙 니 다」하 고 말하였다. 그러자 자반은 그것을 받아 마셨는데, 자반은 사람됨이 술 을 좋아하여 단 맛에 입을 데지 못하여 취하고 말았다. 전쟁아 끝난 뒤 공왕은 다시 싸우고자 하여 사람을- 보내어 장군 자반을 불렀다. 그러 나 자반은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 공왕이 수레를 몰고 가서 장막 속에 들어가 보니 숟 냄새가 났다. 그러자 몰아와서는 「오늘 전쟁 에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되 믿은 것은 장군이었는데, 장군은 또 이 꼴이 라니 ! 이전 초나라의 사직(社稷)을 잊고 우리 백성을 걱정치 않는 짓이 다. 나는 다시 싸우는 수가 없다. 」고 말하고는 군사를 거 두어 돌아가서 장군 자반올 참수(斬首)하였다. 그런데 수하인 양곡이 술을 올린 것 은 자 반을 취하게 하려는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충성으로 그랬었다. 그런데 마 침 자기 상관을-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해가 된다는 것이다. 옛날에 진(晋)나라 헌공(獻公)은 순식 (荀息)을 사신으로 우(慮)나라에 보내어 픽(號)나라를 정벌하러 갈 길을 빌리게 하었다. 그러자 순석이 말하였다. 「청컨대 수국(垂就)의 구술과 굴산(屈症)의 네 마리 말을 우공 (處公)에게 뇌물로 주며 길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얻을 수 있겠옵니다.」 헌공이 말하였다. 「수국의 구술은 내 선군(先君)의 보물이고, 굴산의 네
마리 말온 내 수레를 끄는 말이오. 만약 내 선물만 받고 우리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소?」 순식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우리에게 길을 빌려 주지 않겠다떤 반드시 우리 것을 받지 않 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것을 받고 우리에게 길을 빌려 준다면 그것은 마 치 내부(內府)의 것을 꺼내다가 외부(外府)에 넣어 두는 것과 다름없고 또 안 마구간의 것을 끌어다가 바깥 마구간에 매어 두는 거나 갇습니다. 입금님께선 무얼 걱정하십니까?」 헌공이 허락을 하고 곧 순식으로 하여 금 굴산의 말 네 마리를 우나라 궁정으로 끌고 가게 하고 그 위에 수국의 구슬을 갖고 가서 우나라에게 괵나라몰 치러 갈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 다 우꽁이 보물과 말이 담나서 웅낙하려 하자 궁지기(宮之奇)가 간하였 다. 「응낙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나라와 괵나타는마치 어금니에 광대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금니는 광대뼈가 있어야 하고 광대떠도 어금니에 의하여 기능이 발휘됩니다. 우나라와 괵나타의 형세도 그러합니다. 옛 분 둘의 말에도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려진다고 하였읍니다. 괵나라가 망 하지 않는 것은 우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우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 도 괵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에게 길을 빌려 주어 괵나 라가 아침에 망하면 우나라도 그 처넉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저 들에게 길을 빌려 줄 수가 있겠읍니까?」 우공은 듣지 아니하고 진나라 에 길을 빌려 주었다. 순식은 괵나라를 처서 그들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는 다시 우나라를 쳐서 정복하였다. 순석은 구술을 찾아 들고 말을 다시 끌고 가서 이를 보고하였다. 헌공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구술은 그대로 아 나 말의 이 빨은 좀 더 자란 것 같구려 ! 」 그러 므로 작은~ 이 익 은 큰 이 익의 해가 되는 것이라 한 것이다. 利不可兩, 忠不可兼. 不去小利, 則大利不得;不去小忠, 則大忠不至.故 小利, 大利之殘也 ; 小忠, 大忠之賊也. 聖人去小取大. 昔荊麗王與晋廊公戰於.l!iil陵, 荊師敗, 與王傷. 臨戰, 司馬子反潟而求飮, 堅陽穀操委酒而進之. 子反呢曰 : 皆退酒也. 堅陽穀對曰 ; 非酒也. 子反 曰;返退却也. 堅陽穀又曰;非酒也. 子反受而飮之. 子反之爲人也唯酒,甘 而不能絶於口, 以醉. 戰競龍, 與王欲復戰,而謀使召司馬子反, 子反辭以心 疾. 麗王篤而往視之, 入椎中, 聞酒吳而還, 曰 ; 今 日之戰. 不穀親傷, 所 侍者司馬也. 而司馬又若此, 是忘荊國之社稷, 而不位吾衆也. 不穀無與復 戰矣. 於是麗師去之, 斬司馬子反以爲殿. 故堅陽穀之進酒也, 非以醉子反
也, 其心以忠也, 而適足以殺之. 故曰 ; 小:g , , 大忠之賊也. 昔者晋獻公使荀息, 假道於處以伐號. 荀息曰 ; 請以垂陳之整與屈産之乘, 以路處公. 而求假道焉, 必可得也. l 欲公曰 ; 夫垂練之監, 吾先君之貸也 ; 屈 産之乘, 謀人之駿也. 若受吾幣而不吾假道, 將奈何 ? 荀息曰 ; 不然. 彼若 不吾假道, 必不吾受也. 若受我而假我道, 是猶取之內府,而藏之外府也;猶 取之內阜, 而짱之外阜也. 君溪患焉 ? 獻公許之, 乃使荀息以屈産之乘爲庭 實, 而加以垂練之壁, 以假道於處而伐號. 處公溫於寶與馬而欲許之. 宮之 奇諒曰 ; 不可許也. 炭之與왐써i, 若車之有#i I 也 ; 車依輔, 輔亦依車, 處號 之勢是也. 先人有言曰 ; 曆端而齒寒. 夫號之不亡也侍慮, 漠之不亡也亦侍 發也. 若假之道, 則號朝亡而處夕從之矣. 杰何其假之道也 ? 處公弗聽而假 之道. 荀息伐號克之, 還反伐慮又克之. 荀息操壁李馬而報. 蹴公喜曰 ; 盤 則猶是也, 馬齒亦薄長矣. 故曰 ; 小利, 大利之殘也. (愼大覽 權勅J 〈참고도서〉 『呂氏春秋注』 26 卷, 漢高誘撰 (『四部備要』本). 『呂氏春秋集釋』 民國 許維遜 撰, 文學古籍刊行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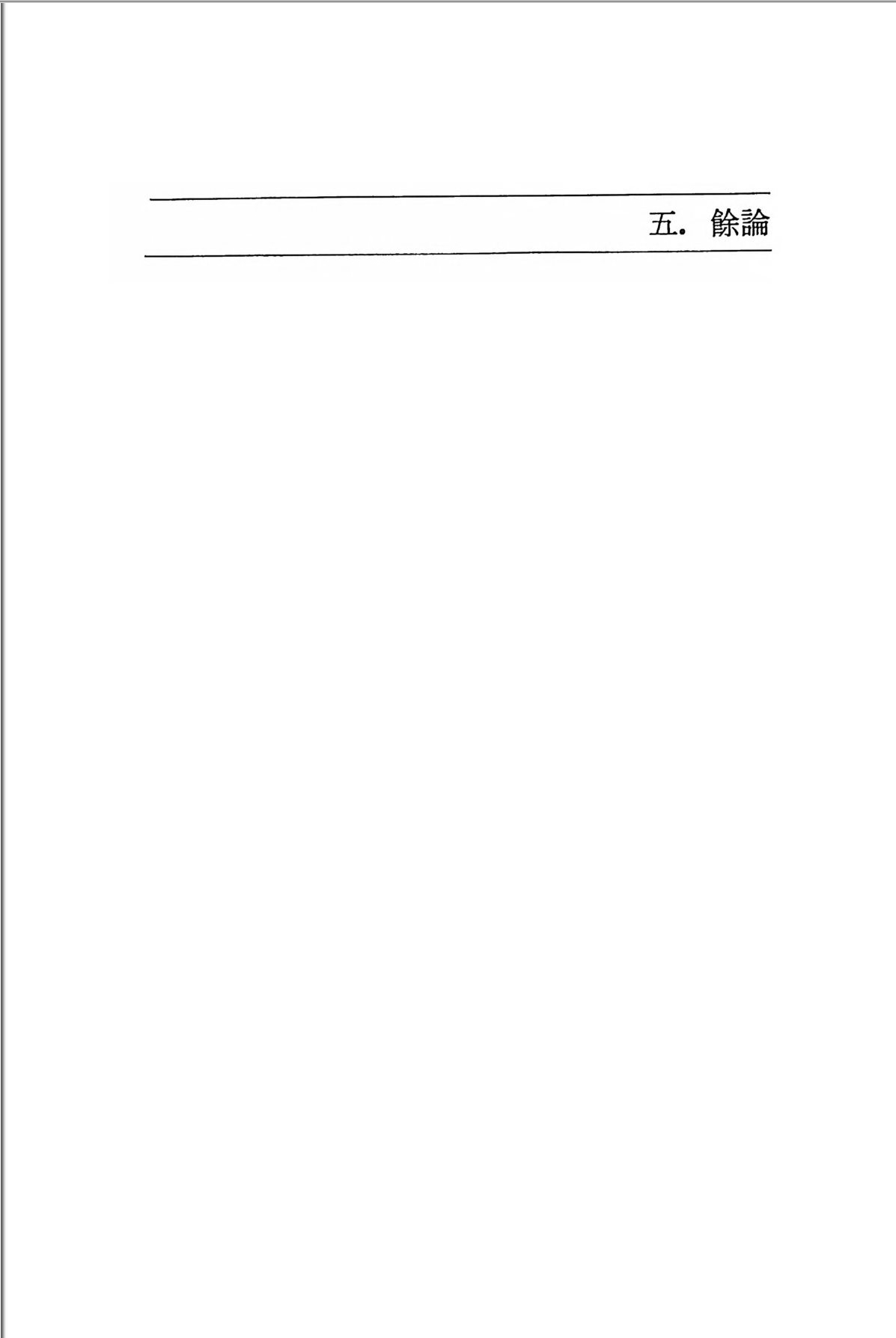 五• 餘論
五• 餘論
1. 〈중국문학사〉에 있어서의 『楚辭』의 문제 1. 『초사(楚辭)』와 굴원부(屈原賊) • 한부(漢斌) • 사부 (辭賊) 이제껏 나온 수많은 『중국문학사』가 모두 전국시대 중영에 굴원 (屈原 B. C.339?~B.C.278? )1)이己J: 위대한 작가가 나와 『초사』란 새 로운 독창적인 시를 지었다 하여 거의 『시경』과 대등한 지위에 놓 고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초사』논 어떤 함의(含義)를 지니고 있는가, 전국시대 중엽에 그러한작품이 나올수있겠는가, 또 굴원 이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여 『초사』己J: 작품을 썼다 하더라도 문학 사에서 그것을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 겠는가 하는 둥의 문제를 따져볼 팔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l) 郭洙若 「仇大的愛國詩人―屈原」(討£ft 1 硏究論文梨』 1957, 作家出版社) 依操.
『초사軒산 본시 〈초어문)나타의 시 가〉 또는 〈초족 G 춘族)의 시 가〉란 뜻의 말이 다. 『한서 』 지 리 지 (地理志)에 처음에 초나라의 현신 굴원이 참소를 당하여 추방되자 이소(離惡) 등의 부를 지 어 스스로를 상도(楊 Rh) 하였 다. …그러 므로 세 상에 『초사』가 전한 다. 始楚賢臣屈原, 被臨放流, 作離肇諸itit以 自 傷悼 •••••• 故世傳楚辭.
하였고, 『수서 (隋바)』 경적지 (經籍志)에서도 『 초사』란 굴원이 지온 것이다 .•••••• 굴원이 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z. 것을 『초사』라 하였다. 楚辭者, 屈原之所作也. ……蓋以原楚人也, 謂之楚辭.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Ii'시 경 』 속에 는 이 미 국풍(國風)의 이 남(二南) 동에 초나라 의 노래가 분명한 작품들이 들어 있고, Ii'논어』 • Ii'맹자』 • 『좌전』 • Ii'장자』 같은 옛 전적 속에는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가 인용되어 있다 .2) 그러나 불행히도 한( 漢 )나타 이전의 기록에는 이를 〈초 사〉 라 부론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초사〉란 말은 한 나라의 문제 (文帝, B.C.179~B.C.157 재위) 무렵부터 유행된 듯하며 , 〈楚辭〉 또 는 〈楚詞〉로 썼다. 3) 그리 고 이 것 이 〈초 나라의 시 가〉를 뜻하는 일 반명사였다면, 한나라 초기부터 크게 유행하였던 〈초가(楚歌)〉 또는 〈초성漠聲)〉 4) 과 어떻게 다른 것이었는지도 알 킬이 없다. 서한(西 漢)때 에 쓰인 〈초사〉라는 말이 〈전국시 대 굴원에 의 하여 창시 된 새 로운 형식의 시가〉를 뜻하는 말이란 증거는 없다.
2) Ii'論語』 微子편의 楚狂 接輿의 노래, 『孟子』 離婁편의 孫子歌 『左傳』 宜公 12 年 의 楚策, 『莊子』 人間但:편의 接輿歌 등, 이 밖에도 상당히 많다.
3) 『史記』 張湯傳 ; 「(朱)買臣以 楚辭, 與(莊)助供幸, 侍中, 爲太中大夫, 用깁t. 」 『漢 합.!l 朱買臣傳 ; 「台邑子嚴助貴幸, 鷹買臣, 召見, 說春秋, 言楚詞 , 帝 4g 說之. 」 『漢꿉』 王襄傳 ; 「宣帝時, 修武帝故革……徵能爲楚辭, 九江被公,召見踊韻. 」 4) 『史記』 項羽本紀 ; 「夜 llll 漢軍皆楚歌 」 同 留侯世家 ; 「上曰 ; 爲我楚鏞 吾爲若楚 歌 」 『漢만,IJ 禮樂志 : 「高祖樂楚聲 」 同 偉延衍傳 ; 「望見延 컴車 , 吸桃楚歌. 」
『초사』는 책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전하는 최초의 『초사』란 책은 동한(東漢) 왕일(王逸 89?~158?) 이 지은 『초사장구(楚W( 章 句)』 이 다. Ii'후한서 (後漢 함) 』 왕일전(王逸傳)에 의 하면, 그가 순제 (順帝, 126~144 재위) 때에 시중(侍中)으로 있으면서 『초사장구』를 지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초사장구』에는 서한의 유향(劉向, B.C.77~B.C.6) 이 이것을 편집했다고 제 @5) 하고 있고, 서(叔)에서도 「유향이 경서 를 전교(典校)하면서 나누어 16 권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현 재의 Ii'초사장구』는 17 권인데, 끝머리 제 17 권은 왕일 자신의 Ii'구사
(九思재이니, 그 나머지는 유향이 편찬한 체재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Ii'한서』 예문지 ( 慈 文志)는 유향의 아들 유 홍 ( 劉 欲, B.C .53?~ A. D.23) 이 쓴 鬪략(七略)』울 근거로 한 것인데도 그의 Ii'초사』는 들 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왕일은 서( 奴 )에서 서한의 회남왕안(淮南王 安, B.C . 178~B.C.122) 이 Ii'이소경장구( 離駿經章 句)』를 지었다 하였는 데 , 5) 본시 Ii'이 소( 離駿 )』란 굴원의 작품에 는 〈경 (經) 〉 자가 붙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Ii'한서』 예문지는물론 다론어떤 기록에도 그런책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 또 동한에 와서는 반고(班固, 32~92) 와 가규 ( 賈 達, 30~101) 도 각각 장제( 章 帝, 76~88 재위)때 Ii'이소경장구(離 O 章 句)』를 지 었 다 했는데 , 『후한서 ( 後漢書 )』의 이 들의 전(傳)에 는 전혀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6)
5) 『 深한 .!I 淮南王安傳에는 「使爲 離類 傳, 旦受認 1 日食時上.」이라 하였는데, 王念孫 은 「傳」은 「傅」의 찰못이 며 , 「傅」는 「試」의 古字로서 通用되 었으니 , 劉安이 지 온 것은 『 離福 試』라 論 하고 있다(『 漢찬 補注』, 『 讀만雜 志』).
6) 『 後漠찬 .!I 班固傳에 는 오히 려 「所學無常師, 不爲표句, 擧 大 義 而已. 」라 하였고, 班 固는 屈 原 울 「 露 才 揚 己」하고 「荀欲求進 , 强非其人 . 」한 형 편없는 人物로 깎아내 리 기도 하였다(見王逸, 『楚辭章句』 fro.
또 『초사장구』에는 굴원의 이소(離裁) • 구가(九歌) • 천문(天 rp1 ) • 구장(九 章 ) • 원유( 遠遊 ) • 복거 ( 卜居) • 어 부( 漁 父)와 송옥(宋玉) 의 구 변 (九 辯 ) • 초혼(招魂), 굴원 또는 경 차( 景差 )가 지 온 대 초(大招) 이 의 에도, 한대의 가의 (賈諱 B.C.201~B.C.169) 의 석서예 評t ), 회남소산 ( 淮 南小山)의 초은사 ( 招 隱 士) , 동방삭( 東 方凱 B.C.161 ? ~B.C.87 ? )의 칠간(七諒), 엉기(嚴思)의 애시명 ( 哀時命), 왕포(王襄 ? ~B.C. 61) 의 구회 (九 懷 ), 유향(劉向, B. C.77~B.C.6) 의 구탄(九歌)과 왕일 자신 의 구사(九思)까지도 들어 있다. 그러니 Ii'초사』란 말 속에는 〈한부 ( 漢 試) 〉 까지 도 포함되 는 것 이 다. 한편 『한서』 예문지의 시부략( 詩 賊略)올 보면 부頃t)에 「굴원부 (屈原 賊 ) 25 편」이 첫 머 리 에 놓이 고 다시 「당록부-(康勒賊) 牛선」 • 「송 옥부(宋玉 I~) 16 편」으로 이어지며 , 굴원부 계열에 20 가(家), 육가(陸 賈 )부 계 열에 21 가, 손경 (孫 卿 )부 계 열에 25 가, 잡부며有賊) 계 열에 12 가를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대 학자들은 굴원의 작품이 나 한대의 부 0 成 )를 모두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보았음이 분명하
다. 아무래도 후한에 왕일의 『초사장구』가 나온 이후로부터 굴원의 작품이 목별한 대 우를 받기 시 작하였 던 것 같다. 뒤 의 소통( 羅統, 501 ~531) 이 『문선(文選)』에서 부( 曲t)와 소(談)” • 칠(七 )8) • 대문 (對間) · 설론( 設論) • 사(辭 )9) 등으로 나누고, 유협 (劉親 , 464 ? ~520 ) 이 『문 십조롱(文心 難龍)』 에서 소( 福)와 부倻t)를 구분한 것도 10) 그 때문이 다. 그러나 이는 지나찬 분류임에 들림없으며, 『초사』나 굴원의 작 품도 모두 〈부〉임에 들림 없는 것이다.
7) 甄에는 屈原의 離甄 • 九歌 • 九章 • 卜居 • 報[父와 宋玉의 招 5l, 劉安의 招范士가 配列되어 있음.
8) 七에는 枚乘의 七發, 曺植 의 七啓, 張協의 七命이 들어 있음 .
9) 對rJl에 는 宋玉의 對楚王 rR1, 設論 에 는 東方朔의 答客難, 揚雄의 解廟, 班固의 答 廣戱 辭에는 漢武帝의 秋風辭, 隣淵明의 歸去來 가 들어 있음.
10) 『文心難龍』에 辨穀 • 徐試판이 각각 따로 있다.
한대에는 〈사부(辭賊)〉,!.J: 말도 많이 쓰였다 .11) 그것은 후세에 까 지 도 쓰여 쳐 청 대 요내 (姚jffi, 1731~1815) 의 『고문사류찬(古文辭類 策) 』 에서도 〈사부〉 속에 『초사』의 작품은 물론 한부( 漢賊) 둥을 다 포함 시키고 있다 .12) 그리고근세에 와서는굴원부 계통의 서정적인 작품 이 〈사(辭)〉이 고, 사마상여 (司 馬相如 , B.C.179~ B. C.ll8) 의 자허 부(子虛 試)같은 서 사적 인 한부(漢賊)가 부偉t)이 며 , 이 들을 합쳐 〈사부〉 라 부른다고 여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본시는 그런 구벌 없이 〈부〉와 같은 뜻으로 〈사부〉란 말을 썼음이 분명하다.
11) 『史記』 司馬相如傳 ; 「會原帝不好辭賊. 」, 『漢한.!I 揚雄傳 ; 「顧符好辭賊. 」, 『魏志. 』 陳思王傳 ; 「年十餘歲, 讀詩論及辭賊. 」
12) 『古文辭類策』에는 後世의 文試(甄賊 • 律賊와 對가 되 는)도 包含되 어 있 다 .
2. 굴원(屈原)과 송욱(宋玉)의 작품 성 격 『초사』란 채에는 10 명의 작가 이름과 17 편의 작품이 들어 있지만, 그 중 중국문학사에서 진정한 『초사』의 작가로 떠받들어 오는 작가 는 굴원과 송욱이 고, 작품은 이 소(離駿) • 구가(九歌) • 천문(天問) • 구장(九 章 ) • 구변(九辯) • 초혼(招魂) • 대초(大招)의 7 편이 다 .13) 이 중
13) 屈原이 지었다는 遠遊· 卜居·漁父는 郭洙若 이하 대부분의 학자들이 淡{t의 僞 託으로 보고 있고, 그 밖의 것들은 分明한 淡代 作品이 다(『楚辭硏究 論 文菓』 作家 出版社 참조).
에도 굴원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머리 네 작품인데 ,14) 〈 구 가 〉 와 〈 천문〉 • 〈구장〉에 대 하여 는 완전한 굴원의 작품이 아니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따라서 『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은 굴원의 〈이소〉 한 편이 남는 것이다.
14) 司馬遷이 『史記』 屈原썼生列傳에서 「余 設離談 • 天 r』 · fB 魂 • 哀郡, 悲其志 . 」라고 말했다 하여 招魂도 屈原의 作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林 몇銘『楚辭燈』, 蔣關 『山奈閣注楚辭』등).
어떻돈 중국의 학자들은 대묵이나 대만을 막론하고 모두 굴원을 전국시대의 〈위대한 애국시인〉이라 떠받들고 있다. 굴원의 전기는 『사기』의 굴원가생 연전(屈原買生列傳)과 유향(劉向)의 『신서 頃f序)』 철사편(節士篇)이 가장 자세한 기록인데, 이 두가지 전기는 서로 어 긋나는 대목도 있고 하여 『사기』나 『신서』의 기록을 그대로 다 받아 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이것은 굴원에 관한 기록이 의십스러운 접이 많고 또 너무 간략한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대 이전의 굳에 는 굴원에 대하여 씌어 있는 곳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청(淸) 말 의 요평 (廢平)이 『초사강의 0 츈辭講義)』 15) 에 서 가장 먼처 굴원의 촌 재 를 부정 하였고, 16) 뒤 이 어 하천행 (何天行)은 『초사작어 한대 고여분辭 作於漢代考)』란 책 17) 에서 굴원을 완전히 부정하며 〈이소〉는 회남왕 (淮南王) 유안(劉安, B.C.178?~B.C.122) 이 지은 유선시(遊仙詩)이고, 그 밖의 작품들도 모두 한대에 이류어전 것임을 고증하였다. 그 뒤 로 위 취 현 (衛衆賢) • 정 적 호(丁迪豪) 등이 18) 하천행 의 설에 동조하 였다. 최근에는 주동윤(朱東潤)이 하천행과 비슷한 입장에서 〈이소〉 는 회남왕 유안의 작품이고 그 나머지 것들도 모두 한대 작품임을 고증하고 있 다. 19) 하천행 과 주동윤의 고증은 상당한 근거 가 있으나 그렇다고 굴원이 가설적인 인물임을 완전히 증명했다고 할 수는 없
15) 『六譯館設 합 』, 1921 年, 四川 存古컨局 刊本.
16) 그는 離毅는 秦始皇의 阿士둘이 지은 「仙眞人詩」로 求仙魂游를 노래한것이라고 수장하였다.
17) 上海 中華 만 局刊, 1948 年.
18). 衛 衆賢 「離穀的作者―屈原與劉安」, 丁迪잣 「離표的時代及其他」(두篇 모두 『楚 詞硏究』, 1937 年, 吳越地史硏究會刊 所收).
19) 朱束潤 「楚歌及楚辭」 • 「淮緊底作者」 • r 淮南王安及其作品」 • 「離類以外的屈試」 (『楚辭硏究論文渠』 作家出版社, 1957 所收, 본시는 1951 年 光明日報 『學術』에 각 각發表) .
다. 굴원의 제 자라 는 송욱(宋玉 B.C .290 ? ~B.C .223 ? ) 에 대 하여 는 몇 군데 단편적인 기록밖에 전하는 것이 없어 그의 생애에 대하여 는 거 의 알 길이 없다. 그의 작품은 『초 사장구 』 에 실란 〈 구변 〉 과 〈초혼〉 이외에도 양( 梁 )나라 소 동(蕭就 501~531) 의 『 문선( 文選M 에 풍부(風 賊) • 고당부( 高唐賊 ) • 선녀부 (神 女 /Lit) • 등도 자호 색부 (登徒子好色 l 試) • 대초왕문( 對楚 王問), 당( 唐 )대에 나온 『고문원(古 文苑 M 에 적부 (副試) · 대 언부( 大言賊 ) • 소연부 ( 小 言 賊 ) • 풍부 (誤 賊 ) • 조부( 釣賊) ·무부 (舞 I !..~ )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초사장구』에 실란 두 작품 이외의 것 들 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한대 이후의 작품이라 보고 있다 . 2 0 ) 그리고 굴 원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면 송욱이 가락된 인물임 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전국시대 중영에 초나타에 굴원과 송욱의 작품 같은 뛰어난 문장이 있었다면, 그보다 분명히 뒤에 나왔고 부까지 지은 순자를 비롯하여 『한비자』 • 『전국책』 • 『여씨춘추』 등에 그 들 의 문학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20) 抽稿 『宋玉 作品의 檢 討 』 (『中國文 學 』 第 7 輯, 1980) 참조 솥
그리고 그 시대의 글을 쓰던 여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불 필요가 있다. 아직 한자의 자체도 통일되지 않았던, 문자학사에서 보면 고 문자시대(古文字時代)였던 그 때에 그처럼 고도의 수사( 修 辭)가 발휘 된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서사( 書寫 )의 방법도 매우 불편하고 죽간(竹簡)으로 이루어지는 책은 무척 번중( 繁重) 했 을 것인데, 강호(江湖)를 유랑하는 사람이 순전한 개인의 분만이냐 감정을 그처럼 방대한 굳로 적을 수가 있었겠는가? 전국시대에 개인적인 처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들은 어지러운 천하 에 대한 겨정을· 바탕으로 한 글이고, 세상을 다스리는왕후(王侯)나 귀족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것들이었다. 아직도 순전히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책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시대 여건으로 보 아 볼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항우(項羽)나 유방 (劉邦)이 모두 초가며歌)를 지 었고 21) 초나라 문화의 영 향이 현저 랬
2l) 項羽의 『核下歌』, 劉邦의 『大風歌』 • 『鴻語歌』 등이 있 다.
었 음 을 생 각할 때 , 〈굴 원부 〉 는 한부 (淡斌) 의 선성 (先聲)으로 한초에 대두했던 문학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인 여건을 근거로 한 추리이다. 굴원과 송욱의 실재여부(實在與否) 는 의십스러운 접이 많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존재한 일이 없 고 그들의 작품이란 모두 한대에 나온 것이라논 증거도 확실치 않 은 것이 사실이다. 3. 문학작품과 그 시대 다시 우리논 냉정히 문학사에 있어서 한 작품을 그 시대의 문학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따져 볼 팔요가 있다. 첫째 ; :::L 작품의 작가가 그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 그 작품이 그 시대에 씌어전 것임도 뜻하게 된다. 둘째 ; :::L 작품이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읽혀졌어야 한다. 그 작품이 창작된 뒤 오랜 동안 숨겨쳐 있어서 그 시대에는 그것을 읽은 독자가 아무도 없다면, 문학사상 그 시대 작품으로 다 룰수가없는것이 된다. 세째 ; 그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이 그 시대 작가들에게 영향울 주 어, 적어도 그와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 지어지거나 그 작품의 사상 이 나 창의 (創 意 )의 일부를 계 승한 작품이 나와야만 한다. 네째 ; 그 작품의 성격이 그 시대환경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굴 원부 〉 로 말한다면 그의 개 성 적 또는 우국적 ( 꽃 國的) 성 격 의 시 가가 나올 가능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한다. 이 밖에도 자세히 따쳐보면 문학사에서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작 품으로 다룰 수 있는 요건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굴원과 송옥 의 경우 한대 이후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상의 요건들을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첫째 요전분이다. 따라서 우리논 문 학사에 있어서의 [j'초사』의 시대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팔요가 있 다고 여겨진다•
4.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첫째, 우리논 문학사에 있어서의 Ii'초사』의 개념 울 다시 한번 정리해 불 필요가 있다. Ii'초사』를 〈초나라의 시가〉란 방향에서 파악한다 해도, 굴원의 작품만이 문학사에서 전국시대 초 나라의 시가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큰 문 계이다. 앞에서 이미 간단히 지적하였지만 중국의 옛 전적 중에는 초나라의 노래둘이 상당히 인용되고 있다. 설사 굴원이란 사람이 전국시대 초나라에 살았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작품이 초나라 에서 읽혔다거나 그의 작품을 본뜬문학이 초나라에 유행한 것은 아 니 기 때 문이 다. David Hawkes 는 The Leg a cy of Chin a 22) 의 문학 부문에 실린 논문에서 「굴원의 시는 무당의 주어(呪語)로부터 약간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23) 굴원의 이름 아래 전해져 오던 초나라의 무가(巫歌)를 한대 작가가 다시 손질한 것 일 가능성 아 많다. 다시 Ii'초사』를 『시 경 』처 럼 특수한 작품들이 실 린 책으로 다문다면, 거기에는 한대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실려 있 으니 더 큰문제가된다.
22) Edit ed by Ray mond Dawson, Oxfo r d Uni v ersit y Press, 1964.
23) 抽稿 『離穀의 性格』 (『東亞文化』 第 16 輯 1979) 에서도 屈原賊는 巫歌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려 노력했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 내원(來源)은 어디에 있든 간에 『초사』 는 한대에 와서 유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식의 개성적 인 문학이라 는 것이다. Ii'초사』란 새로운 형석의 시가는 문체상 한부(漢賊)와조 금도 다를 것이 없다. 『한서』 예문지에서 굴원부(屈原賊) • 송욱부 (宋玉賊)를 순경 부(荀卿賊) • 한부(漢試)와 함께 〈부〉로 다루고 있는 것은 올바론 태 도이 다. 이 Ii'초사』를 포함하는 〈부〉 또는 〈사부(辭 賊)〉에 의 하여 4 언(言)을 바탕으로 한 단조로운 중국의 운문은 다양 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극도의 수사(修辭)의 추구를 봉하여 새로 운 문학의 가능성 을 자각(自梵)하게 되 는 것 이 다. 후한(後漢)에 가 서 오언시 @m 『詩) • 칠언시 (七言詩)가 생 겨 나는 원천도 여 기 에 서 찾
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대 의 〈부〉에 서 비 로소 중국의 문장이 사회 적 인 공용(功用) 의 성겨울 벗어나 개성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노래부를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중국에 는 태 고적 부터 이 미 가요(歌臨)가 민간에 유행 하 여 [l'시경』에는 서주(西周) 이전의 개성적인 작품들도 적지 않개 둘 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l'시경』의 작품들은 그 정치적인 효 용 대문에 굴로 옮겨져 [l'시경』 속에 끼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 개성적인 성격이 문학작품으로 인정되어 거기에 수록된 것은 아니 다. 한대의 〈부〉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기의 이름 울 작품에 내걸고 자기의 사상 감정이나 상상 또는 견문을 아름답 게 글로 표현하는 데에서 새로운 글의 가치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둘의 추구가 주르 문장의 수사(修辭)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의 본격적인 문학은 여기에서 전개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혹 『초사』는 서정적인 것이고 〈한부〉는 서사적인 것이란 차이 를 강조하는 이가 있으나, 이미 『초사』에도 여러 명의 한대 작가의 작품이 들어 있 다. 그리 고 〈 한부〉는 사마상여 (司馬相如)의 [l'자허 부 (子 說賊)』를 비 롯하여 반고(班固)의 [l'양도부(兩都試)』, 장형 (張術)의 『양경 부(兩京賊)』 같은 서 사적 인 작품을 혼히 대 표작으로 내 세 우는 것은 사실이나, 한대 〈부〉작가들의 작품중에도서정적인작품이 상 당히 많다 .24) 한대에 와서 〈부〉가 좀 더 다양한 형식과 성격의 것 으로 발전하여, 한대 초기의 작품과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이것들 울 따로 데어 서로 다른 종류의 문학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4) 班固의 『幽通賊』, 張留 의 『思玄賊』가 있고, 司馬相如의 『大人試』 • 『 美 人試』 • 『 長 l rn차 도 서정적인 성격운 떤 것이며, 其他 作家에게도 列泉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오히려 서기 기원전 300 년울 전후하여 굴원이란 사람에 의하여 『초사』라는 완전히 새로운 위대한 작품이 나왔으나 세상에는 아무 런 영향도 주지 못하다가 100 여년 뒤 한대에 들어와서야 다시 그런 형석의 문학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던 종래의 문학사 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설사 굴원이 전국시대에 실제로 촌재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국시대의 문학으로서는 문학사상 아
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는 것이므로 〈 한대의 문학〉으로 〈 한부 〉 또는 〈사부〉 속에 『초사店춘 포함시 켜 논하는 게 올바론 문학사의 방법 이 라 여 겨 진다. 그래 야만 『초사』의 중국문학사상의 의 의 나 가치 도 더 뚜럿하고 올바르게 파악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중국고대문학사〉에 있어서의 소설•희곡 l. 『한서 』 예 문지 (藝文志)의 소설 『한서 』 예 문지 를 보면 육예 략(六藝略) 다음에 제 자략(諸子略)이 둘 어 있고, 〈제자략〉 속에는 유(情) • 도(道) • 음양(陰陽) • 법 (法) • 명 (名) • 묵澤) • 종횡 (從橫) • 잡(雜) • 농@£)의 9 가(家)에 이 어 끝머 리 에 소설가(小說家)가 끼어 있다. 예문지의 해설에서 반고(班固)는 소설가의 무리는 대체로 낮은 관리들에게서 나왔고, 길거리나 골목에서 얘기하고 오가며 듣고 지껄이는 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小說家者流, 蓋出于牌官; 街談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 라고 말하고, 또 〈제 자(諸子) 10 가 중 볼만한 것 은 9 가분이 다. 〉라고 도 말하고 있다. 결국 반고 스스로 〈소설〉은 하찰것없는 것임을 분 명히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이 시원치않다 하더라도 또 그 것은 〈제자〉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음도 분명한 일이다. 다시 〈소설가〉로는 Ii'이윤설(伊尹說)』 • 『육자설(窓子說)』 • 『주고(周 考)』 • Ii'청 사자(靑史子)』 • 『사광(師廣)』 • Ii'무성 자(務成子)』 • Ii'송자(宋 子)』 • Ii'천을(天乙)』 • Ii'황제설(黃帝說)』 • 『봉선방설(封禪方說)』 • 『대조 신요십 술(待認臣腕心術)』 • 『대 조신안성 미 oJ -술(待認臣安成未央術)』 • Ii'신
수주기 (臣 游周紀) 』 • 『우초주설( 處初周說)』 • 『백 가 (百家 )』 25 ) 둥 15 종류 의 책 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봉선방 설 』 이하 6 종 은 한( 漢 )대에 나 온 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9 종 은 고인( 古 人)의 이름 을 빈 것이 7 종 이 고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것인돗 한 것이 2 종이다 .2 6 ) 이 체 들 이 전 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알 수가 없으나 객 이름만을 놓고 본다면 〈제자서( 諸 子 함 )〉나 〈사서여 켓5 ) 〉와 같은 성질의 것이었을 듯하다.
25) 앞의 4 糖 온 漠 代의 作品임 윤 明 記 하고 있으니 , 뒤 의 Ii'우초주선.!I과 Ii' 백 가』도 漢 代의 것일 듯하다 .
26) 『周 考 .!I와 Ii' 靑 史子』·
이 중 Ii'이 윤설』과 Ii'육자설』온 도가(道 家 )에 도 각각 51 편과 21 편의 것이 27) 수록되어 있고, 음양가(陰 陽家 )에도 『사광』 8 편이 28) 수 록 되 어 있 다. 그리 고 『송자설』은 송경 (宋經 )29) 에 관한 글임 이 분명 한데 , Ii'순자(荀子)』에 따르면 묵가( 墨家 )인듯 하고 1i'장자(莊子)』에 의 하면 도가( 道家 )나 명가(名 家 )에 속하는 사람인듯 하다. 어떻든 묵가나 도 가 또는 명가에 속해야 할 사람의 굳이 무엇 때문에 〈소설가 〉 속에 와 있는가 하는것도 의문이다. 한대의 작품인 『봉선방설(封 神 方 說 )』 도 〈육예 략(六 藝 略)〉 예 류( 禮 類)에 들어 있는 『고봉선군사(古 封禪 ?8 祀)』 22 편 • Ii'봉선의 대 (封 禪 儀對)』 19 편 • Ii'한봉선군사(漢封禪 효 祀)』 36 편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 역시 의문이 간다.
27) 小 說家 의 『伊尹 說 .!1은 27 篇, Ii' 懿 子說』은 19 篇임 .
28) 小 說家 의 『師 1J11l .!I은 6 篇 .
29) 『孟子』 告子 下엔 宋經, 『荀子』 非 十二子, 『莊子』 天下 篇 등엔 宋硏으로 보이 며 , 『莊子』 追造遊篇 의 宋 榮 子도 동일인이라 한다.
다시 반고는 예 문지 에 서 〈소설가〉를· 해 설하면서 「비 록 소도(小 道 ) 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볼 만한 것은 있다.」고 한 공자(孔子)의 말 울 30) 인용하고 있 다. 『장자(莊子)』 의 물(外物)편에 서 는
30) 『 論語 』 子 張 판의 말입
소설을 꾸며가지고 벼슬을 구하려는 것은 큰 도( 道 )에 통함에는 먼 짓 이다. 飾小說以干縣令, 其於大 達 亦遠矣. 라고 하였고, Ii'순자(荀子)』 정명(正名)편에서는
그러므로 지해있는 사람은 도(道)윤 논할 따릅이니, 소가(小家)의 진설 (珍 說) 이 원하는 것 은 모두 쇠 미 한다. 故 智者論道而 已矣 小家珍 說 之所 願皆哀 矣. 타고 말하고 있다. 곧 〈소설〉은 〈 소가의 전설〉 또는 〈형편없는 작 은 인간들의 전기한 얘기〉를 뜻하며, 이는 〈대도(大道)에 동하는 것〉 또는 〈올 바론 도( 道 )〉와는 상반되 는 것 이 란 말이 된다. 곧 〈소설〉이 란 〈소도(小道)에 관한 얘 기 〉이 니 , 중국의 옛사람들 이 소중히 여 간 글이 란 바로 〈 대 도(大道)에 관한 굳〉이 된다. 후한 (後模)의 정 현 ( 鄭玄 , 127~200) 은 Ii'논어 』에 보이 는 〈소도(小道)〉를 〈지 금의 제자서( 諸子합)와 같은 것〉이라 해설하였지만, 이는 정통적인 유학자(船學者)로서의 견해라 할 것아다. 반고가 〈 소설가 〉를 해설하 면서 〈소도〉란 말을 인용한 의 도는 〈육예 략(六慕略)〉에 들어 있는 유가의 경전( 經傳) 은 물론 〈제자략(諸子略)〉에 있어서도 다른제자들 의 굴과는 대 비 (對比)가 된다는 뜻에 서 였을 것이 다. 곧 〈소설〉이 〈소 도(小 道)〉 에 관한 것 이 타면 유가의 경 전들과 제 자(諸子)의 글들은 〈 대 도(大道)〉에 속하는 것 이 라 본 것 이 다. 따라서 〈소도〉란 〈길거 리 나골목의 잡담을 적어 놓은 하찮은 얘기〉인데 비하여. 〈대도〉란 〈천 하를 다스리논 올바론 길과 사람들이 지켜 나가야 할 윤리 도덕 둥 에 관한 글〉이 되는 것이다. 정현(鄭玄)이 제자서(諸子 홍 )를 〈소도〉 라 본것은 유학자로서의 입장 때문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제자들도 모두 〈천하를 올바로 다스리는 법이나 사람이 올바로 살 아가는 길〉 같은 〈대도〉에 관한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소설〉이란 주로 그 굳-의 내용 때문에 육경(六經) 이나 제자( 諸 子)와 구벌된 것이지 그 문체 때문에 따로 분류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문학사가들은 서양 소설 개념의 영향으로, 소설은 허구적(虛構的)인 픽션이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 문 시나 역사적인 기록, 논설문 또는 수필 같은것과는 구벌되는 것 이 라 생 각하여 왔다. 지금까지 나온 거 의 모든 중국문학사나 중국 소설사가 그런 입장에서 중국 소설의 발생과 발달을 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옛날 중국 사람들의 〈소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론 방법인 것이다. 2. 중국 고대 문장의 소설성 (小說性) 이미 앞에서 기회 있을츠4 마다『서경』.『좌전』.『국어』.『전국책』 같은 일반적으로 사서(史 컴 )라고 생각되는 저술의 내용도 대부분이 허구적여絲蜀)인 얘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Jam es L Crum 이 The Chankuo Ts'e and It' s Fi c ti on31) 이 란 글에서 논하였 듯이 『전국책』은 특히 더하다. 이들은 대개 역사적인 사실울 기목 했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전율 근거로 하여 허구적인 얘 기를 꾸며가지고 유가의 정치론이나 윤리관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31) Toung Pao, Vol. 68, No. 4, No 5.
『맹 자』 • 『장자』를 비 롯하여 『한비 자』에 이 르는 제 자(諸子)들도 허 구적인 얘기인 우언(萬 言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의 이 론을 독자들에게 쉽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언 〉 을 활 용하 였다. 앞의 사서여 레} )들은 유가의 정치론이나 윤리 도덕을 강조하 기 위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빌어 그럴싸한 얘기를 꾸며나 갔지만, 제자(諸子)들의 책에서는 자기들의 사상이나 주장의 합리성 (合理性)울 증명하기 위하여 허구적인 얘기를 인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소설적인 기법(技法)은 산문(散文)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 니어서 한(漢)대의 부(賊)와 시에서도 무수히 발견된다. 『초사( 楚 辭)』 에옥( 宋들玉어) 의있 는작 품굴으원(로屈 原알)려의 진 작고품당이부 (타 高는 唐 JL복.판거) • (선 卜녀居 )부와( 神어女 부賊()漁 父. )등,도 송자 호색 부(登徒子好色試), 사마상여 (司馬相如)의 자허 부(子虛試) • 상림 부 (上林賊) • 미 인부(美人斌) 등이 모두 허 구적 인 인물의 대 화와 행 동 묘 사를 통하여 이 루어 진 작품들이 다. 그리 고 『한서 』 예 문지 (藝文志)의 〈잡부(雜試)〉 속에 둘어 있는 〈 7석 주부(客主試) 18 편)은 모두 객 (客)과 주(主)의 대화를 중십으로 이루어전 허구적인 작품임이 분명하며.
그 곳의 〈온서 ([恩忠) 18 편〉도 당(唐)대 의 안사고(顔師古)가 유향/`劉向) 의 『벌목(別錄)』울 인용하여 「서 로 문답하는 것 인듯 하다」고 주를 달고 있는데 32) 역시 모두가 허구적인 문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 이처럼 〈부〉에는 허구적인 기법이 혼히 쓰였었다.
32) 『史記』 楚世家에는 莊王에거 1 ffi.擧라는 사람이 〈進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에 따르면 〈隱〉이 란 관계 없는 듯한 대화를 동하여 중요한 일의 뜻을 깨우쳐 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대 의 악부시 (樂府詩)만 보더 라도 상화가사(相和歌辭) 속에 33) 보이 는 맥 상상(附上桑, 羅敷의 얘 기 ) • 동문행 (東門行, 가난하여 강도질 울 하려 는 남자 얘 기 ) • 부병 행 (婦病行, 어 린 자식 물 데 리 고 상처 한 가난한 남편 얘기) • 고아행 (孤兒行, 형수에계 학대 받는 고아 얘기) 등이 모두 허구적인 얘기들을 노래한 시이고, 그 밖에도 상산채미무(上山采那 漁 쫓겨 난 부인이 전 남편을 만나는 얘 기 ) • 초중경 처 (魚仲卿妻, 초중경 의 처 유씨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자 자살하고, 남편도 따라 죽어 한쌍의 원양새가 되는 과정을 노래한 장편의 서사시임) 둥 무수히 많다.
33) 宋 郭茂荷 『樂府詩集』·
이처럼 중국의 문장이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하는 대로 기록하지 않고, 사실을 기록하되 기록자에 의하여 그 사실의 전행 과정이 재구성되었었고, 또그표현에 생략이 많고 문장이 간략한 것은 한자(漢字)라는 문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자는지금도 자체가간단하지 않지마는주(周)나라시대만 하더라도 자체가 통일되지도 않았었거니와그모양도 매우복잡하였 다. 게다가서사(書寫)의 용구도 크게 발달하지 못하여, 굳울 대부분 죽간(竹簡)이나 목독(木闇)에 썼으므로 지면(紙面)도 대단한 제한울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굳은 모두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나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길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을 왕후(王侯) 나 권세가들이 읽고 자신을 인정받도록 하자는 게 대부분의 저술 목 적이었다. 그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기목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끼어 있는 하찮은 일이나 그 일과 직접 관계 없는 말 갈은 것은 생략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글 울 쓰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사건의 내용이나 대화는 필자에 의 하여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문장에 처음부터 허구적인
굳이 많으면서도 또 서양의 소선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발달했던 까닭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3. 희 극(戱劇)에 대 하여 중국 희 곡의 선구적 인 연구업 적 인 왕국유(王國維 1877~1927) 의 『송원희 곡사(宋元戱曲史)』를 보면, 중국 희 곡의 연원 (淵源)을 상고(上 古) 시 대 의 무(巫)에 서 시 작하여 옛 날의 창우({副優) 및 우회 (俊戱) • 가무회(歌舞戱) 등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고국(古&!J 1) 들 이 전적으로 충과 노래를 중십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 각할 때 이는 당연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문장을 읽어 보면 그들은 어떤 사실의 표현 방법으로 희극적인 수법울 상당히 일찍부터 께닫고 있었던 것 같다. 『서 경 』을 비 롯하여 『좌전』 • 『국어 』 • 『전국책 』은 물론 제 자(諸子)의 글도 많은 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상이나 주장 같 온 것을 희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리고 앞에서 소설적이라고 말한 〈부〉나 〈시〉의 구성 방법도 희극적 이 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이 다. 보기 로 사마상여 (司馬相如)의 자궁1 부 (子虛賊)의 구성 을 살펴 본다. 우선 초 S) 나라에서 자허 (子虛 )34) 라는 사신이 제 (齊)나라로 와 서, 제나라 임금의 사냥에 참여한다. 사냥이 끝난 뒤 자허는 돌아 와 오유(烏有) 선생 과 무시 공(亡是公)을 만난다. 오유 선생 ; 「오늘 사냥은 즐거웠읍니까?」 자허 ; 「줄거웠읍니다.」 「침승을 많이 잡았 나요?」 「적었읍니다.」 「그러면 무엇이 즐거웠다는 것입니까?」 「제 가 즐거웠던 것은, 제나라 임금이 제게 많은 수레와 인원의 동원을 자랑하려 하셨는데 , 처 는 운몽(雲夢 )35) 에 관한 일로 대 응한 것 입 니 다.」 「그걸 들려 주실 수 있겠읍니까?」 「그러지요.」 그리고는 제 34) 子虛라는 이름 자체가 .뜸有先生, 亡是公과 합께 싶제로 存在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35) 雲夢 온 大夢이라고도 하며 楚나라에 있던 큰 湖水 이름. 지금의 湖北 • 湖南에 걷 쳐 있었으며, 曹湖 • 洪湖 • 梁子湖 • 1¥頭湖등 數十個의 湖水 일대였다 한다.
나라 임금울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초나라의 운몽에서 사냥하는 광 경을 설명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아 한편의 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듣고 난 뒤 무시공(亡是公)이 비웃으면서 제나라 나 초나라 같은 제후의 사냥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자(天子)가 상 링(上林)에서 사냥하는 광경을 보았느냐, 천자는 이렇게 사냥을 한 다하고 거창한 상림에서의 사냥 광경을 묘사하는데 , 이것을 따로 매 어 상림 부(上 才t l 武) 라 부르기 도 한다. 특히 『초사( 楚辭) 』의 굴원(屈原)이 지었다는 구가(九歌) 같은 작품 은, 일본 학자 청 목정 아( 靑木 正兒)가 신무(神巫)와 제 무(祭巫)가 충 울 추면서 주고받던 노래를 옮겨 놓은 것으로 해석한 이래로 36), 지 금은 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에 찬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사지 내 는 대 상의 신(神)이 남격 (男格)이 라면 신무(神巫)는 남자가 담당하 고 제무(祭巫)는 여자가 담당하여 아기자기한 맛을 더해주는 게 보 통이 다. 보기 로 대 사명 (大司命 )37) 의 구성 을 설명 하기 로 한다.
36) 淸木 正兒 『新 譯楚辭 』 1 春秋社 刊, 1957.
37) 大司命온 사람의 목숨운 管掌하는 神 名.
먼저 남자인 신무(神巫)가 등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 보려는 뜻 울 노래한다. 그러 면 한 편에 여자인 제무(祭巫)가 등장하여 강신 (降神 )을 중도에까지 나가 마중하겠다는 뜻을 노래한다. 그러자 신 무는 너희들은 내게 수명( 海 命)을 요구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을 노래한다. 제무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대사명 (大司命)과 항께 천제 (天帝)를 모시고 다니며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 시켜 주고 싶다는 뜻을 노래한다. 그러면 신무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음양의 원리를 마르는 것이며 , 그는 그 원리를 따라 사람들의 목숨을 관장할 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노래한다. 그러나 제무는 애인에게 선물을 주듯 선물로 환십을 사며 늙어가는 목숨을 연장해 줄 것을 기원한다. 그러나 신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태 를 하며 되장한다. 제무는 애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럽 슬픈 노태 를 부르다가, 다시 사람의 목숨은 이미 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는 깨달음을 노래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또 소사명(少司命) 같은 것은 주제무(主祭巫)와조제무@助祭巫)가주
고 받는 노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밖에 굴원의 복거(卜居 )38) 와 어 부(漁父 )39) 같은 것도 모두 희극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 니 왕국유 (王國維)가 무(巫)에 서 중국 고극(古 L\! U )의 근원을 찾으려 했 던 것 은 옳은 일이다. 다만 그가 간과( 看 過)한 것은 이미 중국 고대의 가무 가 후세의 가무회 못지 않은 회국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 실이다.
38) 屈原이 困境에 마진 나머지 太卜율 찾아가 占울 치는 내용.
39) 屈原과 漁父가 만나 對 話 하는 내용.
중국의 성 왕(聖王)들은 모두 〈 공성 작악(功 成 作樂)〉을 해 서 반고 (班固 32~92) 는 Ii'백 호동의 (白虎通 義 )』에 서 『예 기 ( 禮 記)』률 인용하여 , 황제(黃帝)에게는 항지優湘 l) 란 음악이 있었고, 전욱( 顯 碩)에게는 육 경 (六莖) , 제곡(帝 營 )에 게 는 오영 (五英) , 요( 堯 )에 게 는 대 장(大 효 ) , 순 며 : )에게는 소소(蕭鉛), 우(禹)에게는 대하(大 夏 ), 탕( 湯 )에게는 대호 (大護), 주(周) 무왕(武王)에게는 대무(大武)란 음악이 있었다 하였 다. 그런데 『예 기 』 권 39 악기 (樂記)에 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 대 무〉의 춤의 내용을 설명한 대목이 보인다. 거기에 따르면 6 성偉합 0) 으로 이 루어 전 〈대 무〉는 1 성 에 서 는 혼란한 은(殷)나타에 서 의 무왕의 다스림울 상칭하는 춤, 2 성에서는 무왕의 은나라 정벌, 3 성에서는 무왕의 남쪽 지방 평정, 4 성에서는 천하 동일, 5 성에서는 주공(周 公)과 소공(召公)을 동용하여 천하를 다스리 는 모양, 6 성 에 서 는 온 천하에 위세를 떨치며 훌륭한 정치를 완성시킨 모양을 충으로 상칭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 중국의 정악(正樂)도 옛날부터 노태나 악기의 연주분만이 아니라 충까지 곁들여 있었고, 거기에는 상당 히 복잡한 정철(情節)이 담기어 있었음을 알수가 있다. 순임금의 음 악 〈소소〉는 9 성이라 했으니 〈대무〉보다도 더 큰 규모의 가무( 歌 舞 )였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음악은 이미 고대부터 가무회(歌 舞 戱) 또는 가무극(歌舞劇)이라 부를만한 것이었고 희극적인구성을이 루었음을 알겠다. 정악(正樂)이 그러하였으니 속악(俗樂) 중에는 더 욱 희극에 가까운 것들이 있었으리라 여겨지나 다만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 다. Ii'주례 (周禮)』 권 24 춘관종백 하(春官宗伯下)에 서 모인
40) 成은 현대 옵악의 章 과 비 숫하였 던 것 같다.
(施人)은· 산악 ( 散 樂) 과 이 악 ( 夷樂) 의 춥 율 관장하고 가르친다 하였 다. 〈 이악 〉 은 말할 것도 없이 오랑개의 음악이고, 〈산악〉은 정현( 鄭 玄, 127~200 ) 이 「야인 ( 野人 ) 이 하는 음악 가운데 훌 륭한 것」을 뜻한다고 주를 달고 있다. 주 ( 周 ) 나라에 이미 의국 음악과 속악까지도 상류 사회에 성행한 것이 분명하나, 그것들의 희극적인 성격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미 중국 고대의 정통문학이나예술 속에서도 중국적인 회국의 발원(發源)을 찾아넬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 론 이 제 까지 나온 『중국문학사』들은 대 개 소설은 명 (明) • 청 ( 淸 ), 회 곡은 원(元) • 명 ·청대에만발달하였고, 옛날에는그런 것이 있지도 않았다는 입 장이 다. 따라서 〈 소설사〉에 서 는 노신(魯迅)이 신화(神 話 ) • 전설(傳 說 )에서 시작하여 육조(六 朝 )의 지괴 (志怪), 당메 f ) 전 기 (傳 奇 ), 송(宋) 화본(話本)으로 중국 소설 발달의 맥 락을 추구했 던 방법을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희곡사〉에 있어 서는 왕국유(王 國維 )가 고대의 무(巫) ·배우(俳 俊 )에서 시작하여 우 어 (後 語 ) • 잡희 ( 雜戱 ) • 가무회 ( 歌舞戱 )에 서 중국 희 극 발달의 맥 락을 추구하였던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 문학에 있어서의 소설이나 희극의 성격을 서양문학 이론의 입장에 서 파악하려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국 고대문학에 있어서는 실용문( 實 用文)과 비실용문g F 實 用文), 운문과 산문의 뚜렷한 구벌 의식조차도 없었으니, 소설이나 희극의 구벌아 따로 있었을 리가 없다. 예를 들면 『좌전』이나 『국어』 • 『전 국 책 』올 보더라도 이것은 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 며 소설도 아니 고, 또 산문인지 운문인지 분벌하기 어 려운 곳도 많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역사적인 기록이라 볼 수도 있고 철학적인 글이라 할 수도 있으며 문학적인 자료라 할 수도 있 음을 뜻한다. 그리고 중국 시사( 詩 史)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산문 사(散文史) • 소설사(小 說 史) • 희 곡사( 戱 曲史)의 자료가 될 수도 있음
을뜻한다. 실제 로 1i'국어 』 • 『전국 책 』이 나 li' 장자』 • li'한비 자』 등의 글을 보면 육조(六朝)의 지괴( 志怪 )보다도 훨 씬 현대 소선의 개념에 접근한 자 료들을 얼마든지 찾 아낼 수가 있다. 또 거기에는 후세 가무회 (歌舞 戱)의 기록보다도 훨 싼 희극적인 구성의 문장을 찾아넬 수 있고, 고대의 시와 함께 실연(宜演)되던 음악이란 또 그것들보다도 훨 씬 회국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 漢) 대의 부 ( !I.ii;) 나 시의 소설 ·희곡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중국의 문장은 처음부터 좋게 말하면 회화적인 형태와 음악적인 독음( 없音 )을 지니어, 글을 지으려면 짧은 한 구절이타하더라도 어 느 정도 예술적인 기교를 팔요로 하는 것이었다. 말을 그대로 적어 놓온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뜻이 압축( 壓縮 )되어 있어야 하고 되도 록 풍부한 함축(含 菩 )과 아름다움을 지녀야만 하었다. 그러므로 일 찌기 중국 사람들이 소설이나 희곡의 기법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것은 서양의 소설이나 희곡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 다. 더구나 희곡의 실연(i t演 )은 충과 노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표현기능은문장보다도뜻에 있어 더 함축적이고 기법에 있어 상칭적아고 아름다움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소 설이타 하더라도 어떤 사건의 전전을 그대로 빠짐 없이 묘사하거나 사람들의 대화를 있던 그대로 옮겨 놓는 낭비는 할 수가 없었다. 춤 과 노래로 표현하는 회국의 겅우에는 더욱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위 를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가 없다. 중국의 소설과 희곡은 처음부터 서양의 그것들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소설과 희곡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 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통적(正統的)인 고 대문학사의 자료들은 모두 소설사와 희곡사의 귀중한 재료가 될 수 있음도 재인식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아래 〈중국소설사 〉 나 〈중국희곡사〉가 다시 씌어지게 되기 바라는 마음 간철하다. 다만 이 li'중국고대문학사』에서 소설과 희곡이 란 분야를 마로 독 립시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소설과 희곡이
일반 산문이나 시로부터 따로 독립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문학사의 자료들이 어떤한분야로분명히 나뉘어지지 않은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 고대문학의 성 격 1. 종합적 특칭 중국 고대문학사를 주(周)나라 초기에서부터 논술을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료란 서주(西周)시대 에 이미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시경』과 『서경』에는 서주시대의 자료가 담겨져 있는 것은사실이나, 그것들이 완전한전적(典籍)으로 정리 편찬된 것은 동주(東周)로 넘어와 공자에 의하여 이루어전 것 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서주 초기부터 기록들이 있었다 하더라도그 때에는 한자의 자체(字體)가 번잡하고통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 왕(宣王) 때에 태사(太史) 주(蒲)가 대전(大菜)을 만들어 자체물 통일하 려고 노력했을 무렵에 그 기록들은 일차적으로- 정리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전국(戰國)시대 이전에는 개인적인 처술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밖의 고대문학 자료들은 모 두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기사(紀事)〉의 글에서 논한 『좌 전』 • 『국어』 • 『전국책』온 전국시대 문장의 발달 단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 『좌전』의 문장은 『서 경 』보다는 발전하였지 만 대 화체 (對話體)를 응용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거기에 비해 『국어 』에 서 는 좀 더 간 논설문(論說文)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 『전국 책』에 와서야 대화나 서술 또는 논설 등의 갖가지 문장 기교가 고 루 발달하고 있 다. 〈입 언 (立言)〉의 굳 중 『논어 』는 『좌전』과 비 슷한
전국 초연울 대표한다면, 『묵자』 • 『맹자』 • 『장자』는 『국어』와 대 응되 고, 『순자』 • 『한바 자』는 『전국책 』과 맞먹 는 전국 말영 의 굳들 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은 전국 말연까지도 각 학 파의 사람들 손에 의하여 계속 수정과 보충이 가하여쳐 이루어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은 한(淡)대에 들어와 예 서 ( #값 書 )로 한자체 가 통일된 뒤 에 다시 한인(漢人)들에 의 하여 편정 된 것이다. 따라서 책의 체재는 물론 그 문장에까지도 한인들의 의 식이 적지 않게 가하여졌을 것이다. 한편 〈임 언〉의 글들을 놓고 보면 『논어 』 • 『묵자』 • 『맹 자』 같은 것 은 전국시대 중국 문화의 기반(基盤)을 이룬 처서들이라 할 수 있 고, 『장자』와 『노자』 • 『열자』 같은 것은새로이 중국 문화권으로 들 어온 남쪽 초(楚)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저서둘이어서, 이들 새로 운 성격의 글들은 전국시대 문화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자』 • 『한바자』 같은 굳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천 하동일울 준바하는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씨춘추』는 천하통 일의 완숙을 대표하여 문자학사에 있어서는 소전(小菜)과 비슷한 위 치를 차지하는 굳이라 할 수 있다. 2. 고대의 문장 의석(意識) 한편 전국(戰國) 이전에 개 인적 인 처술(著述)이 없었다는 것은, 그 때 의 굳울 쓰는 사람들은 글의 전문가인 사관연璃')이 었고, 사관 둘의 글은 모두 천자(天子)가 정치를 하는 참고자료로서만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는 굴자의 자체도 복잡한위에 통일되지 도 않았었고, 문장의 표현 기능도 아직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굳울 쓰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쓴 굳의 독자는 천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읽는 문장이 나 책과 갇은 개념은 촌재하지도 않았다. 춘추(春秋)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기는 하였지만 아직 천하의 질서의 대표자로서 천자를 모시고 있던 때라 개인적인 저작의 필요성이 크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국 이전에 굴을 쓰던 사관 8 곤官)은 대대로 그집안에 전해지던 전문적인 가업(家業)이어서, 그 전문성을 발달시킨 나머지 그 때의 문장은 일상용어와는 다른, 어렵고도 아름답고 미묘한 것으로 발달 하였던 것이다. 또 그것은 한자가 본시 뜻율 표현하는 상형문자 (象形文字)라는 특성과, 천자가 읽는 글이므로 장중(莊 重 )하고 의식 적(儀式的)일 팔요가 있었다는 것도 문장이 그러한성겨울 지니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마라서 이 때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읽는 사람들은 ::J.. 굳이 뜻 울 찰 표현하고 있는가, 아름답고 미묘하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가 등에만 관십이 있었지, 그것이 운문(韻文)인가또는 산문(散文)인 가, 실용문(實用文)인가 비실용문(非實用文)인가, 또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어떤 분야에 속하는 굳인가 따위에 대하여는 관십을 지닐 여유도 없었다. 그처 정치의 참고자료로서 필요하니 굴을 쓰는 것 이고, 그 글을 쓰는 것은 집안의 전문적인 직업이니 되도록 아름답 고 멋지게 글을 구성하여야겠다는 생각만이 작용했을 것이다. 전국시대는 천자의 위치는 무시한 채 일곱 나라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의 아익을~ 위하여 싸우던 시대였으므-로, 여기에서 제각기 다른 지역의 이여울 대표하는 여러 사상가돌이 냐와 자기네 사상을 체계 화하여 굴로 표현하게 된다. 춘추시대부터 중요한 문화권의 한 지 역으로 발전한 노(魯)나타에서는 새로 일어난 지배층의 이익을 대 표하는 유가(儒家)와 서 민층의 이 익 울 대표하는 묵가( 星家) 가 나온 다. 정(鄭)나라를 중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법가는 서쪽의 전(秦) 나라의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과 부합되어 천하동일의 정책을 뒷받 침해 준다. 남쪽의 기후가 온화하고 물산이 풍부한 초@:)나라에는 어 지 러 운 현실을 초국(超克)하려 는 낭만적 인 기 질의 도가( 道家 ) 사상 을 발전시킨다. 이령게 하여 이들은 제각기 『논어』 • 『맹자』 • 『묵자』 • 『장자』 • 『순자』 • 『한비자』등의 처술을 낳게 되고, 마침내 전(秦)나라에서는 천하동일 직전에 『여씨춘추』를 이룩한다. 이들에게 이르러서 저자는 사관문만이 아닌 일반 사대부(士大夫)로 확대되고, 독자도 천자나 왕후(王侯) 이의에 사대부들까지도 가담하게 된다. 이미 문장을 읽
고 정리하는 작업에 사대부들이 가담하기 시작한 것은 춘추시대이 며, 전국시대에는 나라들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학과 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였으므로 상대방울 비평하고 자기의 이론 울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남의 글도 읽고 공부 하는 한편 자기 사상울 문장으로 체계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 여러 학파들의 처술은 지금 모두 어느 개인의 이름 아태 전해오고 있지마는 결코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시기에 처작된 것이 아니다. 모두 그 학파의 여러 사람들이 전국시대 말엽에 이르도록 수정과 첨삭( 添 削)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들이 모두 천하를 올 바로 다스리는 방법이나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 여야만 한다는 목표만은 뚜렷이 지니고 있다. 또 전국시대의 정치적인 혼란은 문장의 형식이나 한자의 자체에 까지도 큰 혼란을 가쳐와, 이 제자(諸子)들은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론 자체의 한자와 제각기 다론 문법 또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글 울 썼다. 이들이 여러가지 자체와 여러가지 형식의 문장으로 자기 네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려는노력은, 결국중국문자와 문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 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북쪽과 남쪽이 전혀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 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 秦漢 )대에 이미 천하 의 문자와 문법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국의 혼란과 지역에 따른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 따라 문장의 표현 기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문장의 형식이 여러가지로 분 화되지는 않았었지마는 이미 후세에 나온 모든 문체(文 體 )가시험되 고 응용되었었다. 운문의 기교분만이 아니라 산문의 기교도 상당 한 수준으로 발전을 이룩하였고, 소설적인 허구성이나 희곡적인 입 체성도 모두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시대에는 순수문학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지마는, 수사( 修 辭)를 동하여 현실적 인 가치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 는 터전은 완전히 마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대문학사〉의 시기는 본져적인 중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시기, 또는 중국문학의 요람기(播庶期)라 할 것 이다. 그리고 그 발전은 주(周)나라 중에서도 동주(東周), 동주 중 에서도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중십으로 하고 있다. 그 때의 문학을 〈요람기〉라 하였지만 그 문장은 결코 유치한 수준은 아니다. 어려 운 한자를 사용하는 문장은 이미 수천년의 경험을 쌓아 매우 우아 · (後雅)하고 아름다운 고급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곧 그 문장 자체 논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예술적인 수준의 것으로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의 문장이나 문학과 중국 의 것을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발전시킨 요인인지도 모른다. 이 후 2000 여 년의 중국문학사물 동하여 볼 때 , 그들은 문학론에 있어 전통적으로 글이란 사회에 기여하여야만 한다는 이른바 〈 풍유 澤璋)〉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수사를중심으로그것을발달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중국문학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글 짜임을 동해서 이루어 지는 묘미에 더 십취하는 경우가 많다. 시나 산문의 명구(名句)들은 그 작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한두 구철을 읽어봐도 아름답고 묘한 맛이 느껴전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 문학에서는 있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중국 문학의 특칭도 이미 고대문학에 그 바탕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4. 한자와 그 書寫方法의 발달을 통해 본 중국 고대문학사의 시대구분 1. 종래 문학사에 있어서의 〈고대〉의 개 념 이제까지 나온 여러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고대〉의 개념은 대 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현대와 대가 되는 개념으로 〈 고대〉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다. 이대 고대와 현대의 분계점(分界路)은 청(淸)나라 말엽 아편 전쟁 (犯片戰爭)울 전후한 시 기 (1 840~1842) 가 되 며 , 〈고대 〉가 봉건사 회(封建社會) 시기를 뜻한다면 현대는 봉건사회의 붕괴시기를 뜻한 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고대〉는 다시 상고(上古) • 중 고(中古) • 근고(近古)로 구분되 고, 그 뒤 에 다시 근세 (近世)를 덧 붙 이 는 것 이 보통이 다. 사무량(謝元蘇)의 Ii'중국대 문학사(中國大文學史)』 (上海, 中華書局, 1918) 가 그 보기이며, 황공위(黃公偉)의 『중국문학 사』( 盜 北, 柏米爾 書 店, 1967) 처 럼 〈상고〉 우] 에 〈원고(遠古)〉를 하나 덧 붙인 경우도 있다. 둘째 는 중국의 전통문학의 역 사만을 대 상으로 하여 , 고대 (古代) • 중세 (中世) • 근대 (近代)로 나누는 경 우이 다. 이 때의 〈고대〉논 문학 사가 본격적인 전개를 보이기 이전의 생성시기 또는 초막시기(初幕 時期)를 가리 킨다. 정 전탁(鄭振錄)의 Ii'삽도본중국문학사(揮圖本中國文 學史)』(北平, 撲社, 1932), 조경 십 여隸稽 R) 의 Ii'중국문학사』(北新書局, 1936), 차상원(車相線)의 Ii'중국문학사』(서울, 東國文化社, 1958) 등이
그 보기이다. 이 때의 〈 고대 〉는 대체로 선진시대(先 秦時 代)를 가리 키는 경우가 많은데, 혹 한(淡)대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시대구분의 방법이 있겠으나, 대체로 위 두 가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첫째의 현대에 대가 되는 개념으로서의 〈고대〉는 실상 중국 전통문학사의 전체적 인 시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고대〉의 성 격과는 맞지 않으므로, 자연히 둘째 개념의 것을 문제로 상게 된다. 그러나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이 〈고대〉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 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 만 보더 라도 시 작을 까마득한 황제 (黃帝) 또는 요순시 대 ( 堯舜時代) 부 터 잡는가 하면 하(夏) • 상(商) 또는 주(周)로 잡기 도 하며 , 끝머 리 도 전(秦) • 한말( 漢末 ) • 건안(建安) 동 일정치 않다. 〈고대〉의 출발 접의 차이는 대체로 문학사 자료의 범위 또는 그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을 것이며, 또 그 끝머리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문 학사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전개를 시작하고 있는가, 또는 본격적인 전개를 시작하는 시기를 〈고대〉로 보는가 〈중세〉로 보는가 하는 따 위의 차이로 말미암는 듯하다. 어떻든 문학사에 있어 〈 고대 〉 에 어 떤 의의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사 전체의 성격에도 결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문학사』에 있 어 서 의 〈고대 〉와 〈고문자(古文字)시 대 > 중국문학은 세 계 다른 곳에 유례 (類例)가 없는 독특한 한자(漢字) 를 사용하여 이 루어 지 고 발전한 것 이 다. 한자는 상형 문자(象形文字) 기어서 굴자마다 득유한 형체와 구체적인 뜻을 지니고 있고, 또 굳 자마다 단음절(單音節)로 된 독음(讀音)을 지 니 고 있 다. 중국의 문 장은 이처럼 제각기 독립된 뜻과 독특한 모양과 독음을 지닌 문자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표음문자(表音文字)로 적는 다 론 나라의 문장과는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 한자는 상형문자이며 한 글자의 모양이 복잡하여 사람들의
일상용어를 그대로 적기에는 불편한 글자이다. 따라서 중국의 문장 은 중국어가 문장의 뼈대가 되었었겠지만 자연히 뜻의 축약(縮約) 된 표현에 노력하게 되어 거의 처음부터 일상용어와 문장은 그 성 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서로 언어가 다른 여러 종족들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 같은 문장을 지어 온 역사적 배경에도 원인 이 있을 것이다. 여하돈 뒤에는 한자 사용으로 말미암은 문장의 성 격이 오히려 중국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둘째 ; 한자는 자형 (字形)이 복잡하고, 옛 날에 는 자체 (字體)가 통 일되지 않은 위에 서사용구(書寫用具)도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굴자 를 쓴다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이었고, 매우 정력을 기울여 썼으므 로 글자를 쓴다는 그 자체가 예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 고 한자의 복잡한 자형은 이것들을 결합시켜 문장을 이물 대 구성 을 동한 형석미(形式美)에 관십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세째 ; 한자는 제각기 독립된 독음(讀音)을 지니고 있고 또 성조 (聲調)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한자를 두 자 이상 결합시킬 적에는 독음의 해화(諸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문장은 뜻의 표현과 문법 이의에도 독음에 대한 배려가 문장을 이루는 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곧 중국에 있어서 논 수사(修辭)에 있어 음악적인 요소가 매우 중시되지 않을수 없었 음을 뜻하는 것이다. 네째 ; 중국에 있어 한자의 발명과 사용은 거의 중국 역사의 시작 및 그 발전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전시대(先秦時 代)만 하더라도 한자는 자체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종이도 없어 서사용구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따라서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으므로 문장은 되도록 축약시켜 간단한 몇 글자로써 풍부한 뜻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굴은 혼히 제한되고 일정한 면(面)을 지난 죽간(竹簡)과 목독(木賊)에 가장 많이 썼을 것이므로 문구의 길이도 일정한 것이 편리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문장은 옛날부터 시적(詩的)인 성격의 것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득칭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자는 중국 문장의
성격이나 중국문학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문학의 독칭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한자 의 영향을 먼저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자가 중국 문학의 발전에도 〈고대〉에는 특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 정 아래, 한자와 그 서사방법의 발전울 중십으로 문학사의 시대구 분 문제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반드시 그 나라 문자의 발달과의 연결 아래에서만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특 히 중국문학사에 있어서는 한자가 문학에 끼찬 영향이 크므로 이는 합리적인 시대구분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자를 중십으로 하여 문학사의 시대를 생각할 때, 그 〈고대〉는 대체로 문자학(文字學)상의 고문자(古文字)시대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당란얘 郞 j)은 그의 『고문자학도론(古文字 怨諒論 )』 (p .4) 에서 소전(小 篠 )까지를 고문자(古文字) (근고문자(近古文字)라 부를 수도 있다 하였지만)라 보고, 예서( 隸書 )에 이르러서야 근대문 자(近代文字)의 개산시조(開山始祖)가 되고 있다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문자로는 소전(小~) 이전에 옛날의 여러가지 금석문(金石 文)과 상(商)대의 갑골문(甲骨文) 및 주서 (雍 書 ) 또는 대전(大 篠 ) 등 이 있다. 따라서 〈고문자시 대 〉는 상고(上古) 시 대 로부터 진시 황 ( 秦 始皇)에 이르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근대문자가 예서( 隸書 )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본격적 인 근대문자의 정착은 해서(階 書 )부터라고 볼 때 문학사에서 본격적 인 문학사의 전개가 막 시작된 시기까지를 〈고대〉로 보는 견해에 상응시킨다면 그것은 〈예서〉가 만들어전 진나라 시대까지 또는 〈해 서〉가 만들어전 동한(東 漢 ) 장제 ( 章 帝)의 전초며印初) 연간 (76~83) 까 지로 연장된다. 3. 한자 및 그 서사방법을 통해 본 문학사의 시기 1) 고문자(古文字) 시 대 가) 주(周) 선왕(宜王) (B.C. 827~782) 태사(太史) 주g웁) 이전 상(商) 나라 시대 이 시기의 한자로는 종정문(鍾鼎文) • 갑골문(甲骨文) 등이
남아 있다. 갑 골 문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수준의 문자입에 룹립 이 없고, 상( 商) 대에는 가무( 歌舞) 도 상당히 발달하였었다. 따 라서 이 미 그 시대에 상당히 발달한 가요 (歌話) 나 설화 (說話) 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료 중에는 문학사에서 다 룰 만 한 상대 이전의 작품이 란 한 편도 없다• 명 (明)대 양신( 楊愼 )의 『풍 아일 편(風雅逸篇 )』과 풍유눌 (馮惟訥 )의 『 풍아광일 頃내t[tl~ ) JI 및 『 시 기 (詩紀) 』 전집 (前 菜 ) 10 권 고일 (古 逸) 속에 는 신농씨 ( 神似 氏)의 사 사( 雜辭 ) [『 綾記』 鄕 特性 〕, 황제 ( 黃 帝) 때 의 란가( 彈歌 ) 〔 『吳越春秋JI J • 유영씨송(有 쌌 氏 碩 ) 〔 『莊 子 』 天運 〕 • 유해시 ( 游海詩 ) 〔王 森 『捨追記』 〕, 소 호(少 昊 ) 때의 황아가( 皇峨歌 ) (同上〕 • 백제가(白 帝歌 ) 〔同上〕, 요( 堯 ) 입 금 때 의 격 양가 (!接埃歌 ) 〔『 論衡』 鼓增 〕 • 강구요 에峰藍話 ) [ 『 列子 』 仲尼〕, 순( 舜 ) 임 금 때 의 경 운가( 卿雲歌) 〔『尙喜大傅』 〕 • 남 풍 가( 南風歌 ) 〔 『 孔子 家語 』 辯樂解 J • 우제 가( 炭 帝 歌 ) • 〔 『尙書』 〕 를 비 롯하여 하( 夏 ) • 상(商) 대의 가요들이 모아처 있지만, 모두 그것들의 출전(出 典 ) 자체가 주 ( 周) 이 후 의 책 들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서경 E 기 요전( 堯 典) • 순전 ( 舜 典) • 하서 ( 夏書 ) • 상서 (商 書 )들도 모두 주( 周 ) 이 후에 이 루어 진 기 록이 고 『시 경 』의 상송( 商碩 )도 후세 송( 宋 )나라의 노 래 이 다. 서주(西 周 ) 시대의 작품임이 거의 틀림 없는 『시경 』 의 주송價 ] OO 울 비 롯 한 여러 편과 『서경』의 주서( 周홉 )의 여러 편 등도, 실은 이 미 서주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저는 형태로 기록된 것은 아니 다. 서주시대에도 , 한자는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았고 문자의 동용 범위도 매우 좁았다. 선왕( 宣 王) 때의 태사Q건 史)가 . 발명하였 다는 주서( 摘합 )는 이 시대의 자체(字 體) 동일의 노력의 결정이타 할 수 있으며 〈 주서〉가 나온 뒤에야 서주시대의 자료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던 듯하다. 서사의 방법도 지금 전하는 것은 갑골(甲 骨 ) • 금석 (金石) 문이 나 죽간(竹簡) • 목독(木) 莊 )을 많이 사용했을 것 아 며 , 〈주서〉와 함께 필북 ( 1 U:~ )도 한 단계 더 발전했었을 것이다. 나) 주서(范 書 )시대 주( 周) 선왕( 宣 王)때로부터 공자(孔子 ; B.C. 551 ~479) 에 이르는 시대, 곧 서주 말엽에서 춘추시대( 春 秋時代)에 결찬 기간이다. 문체동일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공자에 이르러 비로소
〈육경(六經)〉의 편정이 가능하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문체가 다듬 어전 정도로 필묵 같은 것도 이전에 비하여 발달했을 것이다. 이 시대도 옛부터 전해 오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편찬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작자는 여전히 사관여효f)을 중십으로 한 일부 전 문가들이고 독자는 그대로 천자(天子)였다. 따라서 일찌기 나근택 (羅根澤)이 『전국전무사가처 작( 戰 國前無私 家 著作)』 (『古史辨』 第 4 冊) 이란 글을 썼듯이, 이 시대엔 개인적인 처술이란 아직도 촌재할 수 가 없었다. 다) 분열(分裂)시대 대체로 전국(戰國)시대 (B.C. 453~247) 와 맞먹 는 시기이다. 전국의 시대상황과 마찬가지로 문자도 여러 나라가 제각기 다론 자체를 발전시켜 자체와 문장에도 큰 혼란이 있었던 시대이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제각기 다론 입장을 대변하는 제자 (諸子)라 불리우는 사상가들이 나와 제각기 자기 사상을선전하고 체 계화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 이것들이 여전히 제후나 귀족 같은 지 배층(支配府)을 독자로 의식한 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중국에 개 인적인 처술이 비롯되고 있다. 다만 『한서』 예문지에서 제자의 원 류를 논하면서 이들이 모두 관(官)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 로 유가는 사도지 관(司徒之官), 도가는 사관(史官), 법 가는 이 관 (理官), 명 가는 예 관( 禮 官) 등), 아직 도 이 들이 완전히 개 인적 인 성 격의 것으로노 화하지는 못했음을 암시한다 볼 수 있다. 어떻든 제각 기 다른 자체를 사용한 다양한 문장의 처술은 결국 중국의 자체와 문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를이 되었다. 이 · 분열을 동해서 소 전(小 篠 )에 의한 자체의 동일이 준비되었고, 중국 문장은 여러가지 서술이나 논설의 능력 등이 고루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 지 역에 따라 다양한 서사방법이 시도되어 필북이 크게 발전하였을 것 이며, 백서(用 書 )도 이 시기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듯하다(근래 초묘(楚墓)에서 발견).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국( 戰 國)이 전시황(B. C. 246~210 재위)의 천하통일로 결 말이 나듯, 문자의 혼란도 거 의 같은 때에 소전(小~) 또는 전전여璋鎬)에 의한 통일로 매듭지어진다. 그 리고 진나라의 동일이 오래 가지 못하였듯이 〈소전〉의 사용도 얼 마 가지 못하고 본격적인 문자의 통일은 예서(隸 書 )에 미루지 않으
면 안되게 된다. 어떻든 이 시기에 〈육경(六經)〉을 비롯하여 제자 서(諸子랴), 사서( 史법) 둥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국고대문학사 의 자료둘이 정리되고 저술되고, 또 지석인들 사이에 그것이 널리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개인적인 사가(私 家 )의 저술아 이 시 대에 시작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중국문학의 시원(始 源) 은 이 때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예서 (隸書)시 대 진시 황 때 로부터 동한(東 漢 ) 장제 ( 草帝 ; 76~88 재위)에 이르는 시대. 일단 소전(小鉉)에 의하여 통일된 한자는 다시 전시 황 때의 정막( 程逸) 에 의 하여 다듬어 지 고 간화(簡化)되 었다는 예 서 (隸 판 )에 의 하여 완전한 봉일을 누리 게 된다. 자체의 동일로 문장이 비 로소 보편화되 어 사부(辭賊) • 악부(樂府) 등 완전히 개 인 적인 성격을 떤 문장이 이때부터 지어지게 된다. 이 시대에 옛날 부터 전해오던 전적둔도 다시 한번 정리되어 비로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지니게 되어, 이른바 경(經) • 사 (史) • 자(子) • 집 ( 集 )이 갖추어 진다. 죽간(竹簡) • 목독(木版) 이 외 에 비단도 더욱 널리 쓰이고, 자체의 정리와 통일에 따라 필(筆) • 묵 澤 ) • 연(視) 등도 비로소 현대의 것들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게 된 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문장의 정치적 사회적 효용 이외에 도 수사( 修辭 )를 통한 새 로운 미 (美)의 추구의 가능성 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걷고 개성적인 문장을 쓰 기 시작하는 것은 이 시대이다. 중국문학사는 여기에서 본격적인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마) 해서(指 書 )시대 동한( 東漢 ) 장제 ( 章帝 ) 때에 왕차중(王次仲)이 해 서(槿 書 )를 창제한 이후 현대에 이르는 시기이다. 유덕승(劉德昇)에 의한 행서(行 참 )의 창제와 채문( 蔡倫 )에 의한 종이의 발명도 몇년 밖에 이에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장 또는 문학은 보편화되고 서사용구도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 서시대〉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고대〉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시기 이다.
4. 결 론 이상 한자와 그 서사방법울 중십으로 문학사의 시기를 구분해 보 았다. 이 에 의 하면 @ 주(周) 선왕(宣王) 때 태 사(太史) 주(節)가 〈주 서〉를 발명하기 이전의 시대는 문학사의 준비시대라 할 수 있다. 문학의 원조라 할 만한 시가나 문장이 상당히 발달하기논 하였지만 문학사에서 다물만한 본격적인 자료들은 아칙도 완성된게 없었다. @ 〈주서〉시대는 자체 통일 노력의 성과로 비로소 이전의 자료 들을 정리하여 〈육경〉이 편정될 수 있었던 시대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문학사의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적인 처 술은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문학이 생겨났다고 하기논 어렵다. @ 〈분열〉시대에 이르러 자체는 더욱혼 란해졌지만 개인적인 처술이 유행하여 비로소 문학사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때의 글도 모두 정치적 사회적 효용을 위한 문장들이어서 문학 의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지니었던 시대이다. 그리고 ® 〈 예 서〉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중국의 문자는 자체의 통일을 이루고 문 학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본격적인 문학사를 전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고대〉문학사는 일반적으로 상(商)대 이전부터 논 술을 시작하고 있으나 서주(西周)로부터 시작하여도 찰못이 없다. 그리고 문학사를 보는 입장에 따라 그것은 진시황 때 또는 동한(東 漢) 장제( 章帝 ) 때로 그 마무리되는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문학사상 변혁의 매듭온 서주(西周) 선왕( 宣王) 때, 공자 때, 진시황 때, 동한 장제 때 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자 및 그 서사방법에 따론 중국고대문학사의 시대구분 은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라 우길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 게 전해지고 있는 문학사의 자료의 정리와 정치적 사회적 여건 둥 을 아울러 고찰할 때 보다 합리적인 시대구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색인 1
-, 가규(賈達) 205 가의 (賈謙) 205 강왕(康王) 66 강유우] GF 有爲) I I4 건숙(裵叔) I23_5 걷(~) 96, 181 견오(周吾) 171, 173 경 제 (景帝) 51, 88, 148 경차(泉差) 205 계 찰(季札) 42, 47 고영무(顧炎武) 62 고요( 半 陶) 99-101 고자(告子) 156 고형 (高亨) 189 곤(絲) 98-9 공구(孔丘) 144 공보문백 (公父文伯) I27 공산불요(公山弗擬) 150 공서화(公西華) 152 공손추(公孫丑) 155 공숙단(共叔段) II6-7 공안국(孔安國) 86, 88 공왕(恭王) 88 공왕(郞王) 198 공자(孔子) 14-5, 17, 20, 24, 32, 34, 42, 46-8, 50, 79-80, 87-93, 102, 106, 113-4, 147-52, 155, 158, 162, 174, 176, 178, 214, 220, 224, 233, 236 곽말약(郭洙若) 66 곽상(郭象) 168 관자(管子) 146, 194
관중(管仲) I27, I9I, I94 픽 문공(號文公) 128 굴만리(屈萬里) 62 굴원(屈原) 185,203-2I1,216,219-220 쿵지 기 (宮之奇) I99 귀 곡자 0 屈谷子) I46 L 나근택 (羅根澤) 17, 234 노담(老ljij) 144 노래자(老萊子) 174 노신(魯迅) 221 노자(老子) 15, 168,174-6,187-8, 192, 225 C: 당란(唐 00) 25, 232 대공@戈公) 68 덕종(篠宗) I04 도참(陶港) IO3 동방삭(東方朔) 205 동중서(董仲舒) 86 두립(杜林) 88 두두원태후관((杜廣太原后軟)) ”I33 , I35 등문공(勝文公) i5 5 E3 마서문(馬叔倫) I'7 6 만장(菓적i) 155-6 매색(梅~) 88
맹 가(孟tPJ) I55 맹 상군(孟썰君) 143 맹자(孟子) 146-7, 155-160, 162, 168, 172, 174, 176, 178, 189,204,216,225-6 모공(毛公) 52 목공(穆公) I23 목왕(穆王) 128 무공(武公) u6-7 무왕(武王) 66,94-5,99, 122,220 무제 (武帝) 14, 19, 51-2 묵자(墨子) 20, 86, 146, 158, 162-3, 166-7, 170-1, 180, 183, 189, 225 묵적 (墨霞) 144 군 62 문공(文公) 123-4, 135 문왕(文王) 55-6 , 61, 66, 77, 106, 124, I57 문제 (文帝) 51, 86-8, 204 1::1 반고(班固) I8, I47, 205, 2II, 2I3-5, 220 백양(伯陽) 174 백우(伯牛) 151 복생 (伏生) 86, 88 부사년(傅斯年) 61,68 Ba rthe s, Rolland 19 A· 사마상여 (司馬相如) 206,211,216,218 사마천(司馬遷) 47, 86, 174, 188 사마표(司馬it&) 168 사무량(謝元료) 229
상앙(商陝) I87 상자(商子) I46 선공(宣公) 67 선왕(宣王) 61, 128, 224, 232-3, 236 선제(宣帝) 52 선태 후(宣太后) I42 성공(成公) II7, II9 성 왕(成王) 66, 93 성 제 @戈帝) 52, 89 소공(昭公) II6 소공(郡公) 128-9 소공석 (召公奭) 61-2, 220 소목공호(召穆公虎 • 召公虎) 6I-2 소백 (召伯) 6I 소순(蘇r!U) 160 소식 (蘇試) 160 소왕(昭王) 66 소제(昭帝) 52 소전(薛秦) I37, I42 소호(少昊) 4I, 233 소통(蕭統) 57, 206, 208 손경 (孫卿) 178 손무(孫武) 144 송경 (宋經) 2I4 송영 자(宋榮子) 173 송옥(宋玉) 205-6, 208 궁, 2I6 순(舜) I2, 4I, IOO, I72, 220, 233 순경 (荀卿) 179 순식 (荀息) 198-9 순자(荀子) 42, 50, 146, 175, 178-183, 185, 187-9, 194, 196, 208, 225-6 순제(順帝) 204 산농(神農) 41, 233 신도(愼到) 187
선배(申培) 51 신불해 (申不害) 187 신생 (申生) 127, 131-2 신자(申子) 194 。 안사고(顔師古) 2I7 안솔(顔率) 138-140 안연(顔淵) 148 안회 (顔回) 103 양경 (楊{京) 179 양계 초(梁啓超) 63, 65, 162, 174, 176 양공( 襄 公) 42, 68, Il 5 양신(楊愼) 41, 233 양자(楊子) 158 양주(楊朱) 196 양혜 왕(梁惠王) 155-6 양화(腸貨) 148, 150-1 애공(哀公) 113 엄 기 (嚴思) 205 여공(腐公) 198 여 불위 (呂不韋) 196 여 영 량(余永梁) 91 여 왕 (1PEE) 128-9 연숙(連叔) 171, 173 연어 구(列禦冠) 171, 176 연자(列子) 41;146, 168,173,176,225, 233 영약거(閣若~) 88 영유(再有) 152 영공(靈公) 42 예 양부(丙良夫) 128 오기 (吳起) 187
오민수(吳敏樹) I58 오자(吳子) I46 완원(阮元) 65 완적 (阮籍) 103 왕가(王嘉) 41, 233 왕국유(王國維) 65-6, 68, 218, 220-I 왕백(王柏) 67 왕신검(王先謙) 86 왕숙(王체~) 89 왕숙지 (王叔之) I68 왕일(王逸) 204-6 왕중(江中) I74 왕질(王質) 62 왕차중(王次仲) 235 왕충(王充) 4I 왕포(王要) 205 요(堯) 12, 19, 41, 97, 172-3, 181, 184, 겔 9, 220, 233 요내 (姚jffi) 206 요순(堯舜) 102, 230 요평(廢平) 207 우(禹) IOI, 184, 189, 220 우시(俊施) 131 원고(綾固) 5I 원제(元帝) 52 위 원 (魏源) 62, 67-8 위전(魏晋) 88 위 치 현 (衛緊賢) 207 유방(劉邦) 208 유덕 승(劉德昇) 235 유안(劉安) 207 유종원 (柳宗元) IO5, I6o 유향(劉向) 136, 179-180, 204-5, 207, 2I7
유협 (劉{Jf£) 206 유홍(劉欽) I14-5,205 유회 (劉熙) 31, 44 육간여(陸偏如) 62 육덕 명 (陸 德 明) 168 윤회 (尹 喜 ) 174 온공( ~없 公) 62, 113, 116 이국(里克) BI 이 사 (李斯 ) 25, 29, 187-8 이이(李顯) 168 이자(李子) 194 이혁 (里革) 127 이회 (談姬) 131-3 그 자로(子路) 148, 151 자반(子反) 198 자사(子思) 155 자산(子産) I 16, 144, 187 자장(子張) 148-9 자하(子 夏 ) I48 장공(莊公) 1I 6-7 장담( 張 謀) 176 장문중( 威 文仲) 127 장서 당( 張 西堂) 179 장선( 張統 ) 58 장애 백 ( 威 哀伯) l2I 장우( 張 禹) 149 장의 ( 張儀 ) 137, 142 장이 인 (張以仁) 127 장자(莊子) 20, 41, 146, 160, 168-176, 192, 204, 214, 216, 222, 225-6, 233 장제 ( 章 帝) 205, 232, 235-6
장주(莊周) 168 장패(張覇) 89 장학성( 章學 誠) 43 장형 ( 張 衡) 211 전목( 錢穆) 174 전욱( 類 預) 220 접여 ( 接輿 ) 171 정고보(正 考 父) 68 정대창(程大昌) 62 정 막(程 逸 ) 25, 235 정수( 鄭襄 ) 141 정왕(定王) I36 정이( 程 顯) 147 정적호 CT 迪 豪 ) 207 정전탁(鄭振 鎔 ) 229 정 현 (鄭玄) 47, 53, 57, 80, 148, 215, 22I 계곡(帝 싼 ) 220 제선왕( 齊宣 王) 156 조경 십 ( 趙崇深 ) 229 조고( 趙高 ) 25 조착( 昴鉛 ) 88 좌구명 (左丘明) 14-5, I14, 127 주(討) 96 주공단( 周 公旦) • 주공(周公) 61-3, 91,93,95-6,220 주동윤(朱 東潤 ) 207 주선왕( 周宣 王) 23 주희 ( 朱熹 ) 6o, 63, 67, 73, .14 7, 155, I78 중궁(仲弓) 148 중니(仲尼) 180 중산보(仲山父) m8 중이 ( 重 耳) I27, I3I, I35
증상(曾參) 103, 155 증석 (曾哲) 152 전시 황(秦始皇) 12-4, 25, 29, 35, 87- 8, 136, 188, 196-7, 232, 234-6 전신사(陳臣思) 139 전이 제 (秦二世) 188 云 차상원(車相頓) 229 채 문(蔡倫) 26, 235 청 목정 아( 靑 木正兒) 219 최선(崔議) 168 최 술(崔述) 43, 149-150, 174 E 탕(湯) 220 태 사담(太史億) I74 태사(太 oo 66 .II. 풍완군(馮玩君) 62 풍유눌(馮惟訥) 41, 233 궁 하간현왕煙河間獻王) 52, 88 하안(何~) 148
하천행 (何天行) 207 한고조(漢 高祖) 19, 51 한비 (韓非) 187-9, 191-2 한비 자(韓非子) I38, 146, 160, 175, 187-190, 192-4, 196, 208, 216, 222, 225-6 한영 (韓*) 51 한유(韓急) 103, 124, 155, 160, 174, 188 한자(韓子) 188 항우(項羽) 208 향수(向秀) 168 해제(矣齊) 131 허선(許愼) 24,31,44,85 허유(許由) 173 헌공(獻公) 127, 198-9 혜동(惠棟) 88 혜시(惠施) 173 호무경(胡毋敬) 25 호적 (胡適) 179 화보독(華父督) 121 화제(和帝) 26 환공(桓公) 67, 121, 127, 191 황간(皇何) I48 황공위 (黃公偉) 229 황제 (黃帝) 41, 220, 230, 233 회 남소산(淮南小山) 205 회 남왕(淮南王) 205, 207 회 공(僖公) 67, 91, 123, 125, 131 Hawkes, David 210
색인 乙
기 가무극(歌舞劇) 220 가무회 (歌舞戱) 218, 220-2 가요(歌諾) 2I, 8o, 233 갑골문(甲骨文, 甲骨文字) 12,23,232 강구요(康術~) 41, 233 객주부(客主試) 2I6 건안(建安) 230 격 양가(整坡歌) I2, 4I 군 33 견웅(犬戒) I28 겹 애 여祀愛) I63, I65-6 경전석문(經典釋文) I68 경 운가(卿 雲歌 ) I2, 4I, 233 고(部) I2I-2 고논어 (古 論語 ) 148-9 고당부(高唐試) 2o8, 2I6 고문(古文) 24, 87-8, 102, II3 고문가(古文家) 32, I I4, I6o, I88 고문사류찬(古文辭類墓) 206 고문상서 (古文尙 書 ) 86-8 고문상서 고(古文尙 書 考) 88, 102 고문상서 소증(古文尙 書疏證 ) 88 고문자(古文字) 23-6, 174, 208, 230, 232 고문자시 대 (古文字時代) 3 고문원 (古文苑) 208 고문자학도론(古文字學導論) 232 고서전위 급기 년대 (古 書眞僞及其年代 ) I76 고시(古詩) I5 고시 십 구수(古詩十九首) 57 고아행 (孤兒行) 2I7
곡량전 (穀梁傳) 114-5 공양전(公羊傳) 114-5 공자가어 (孔子 家語 ) 41, 233 공전 (孔傳) 86, 88-9, l02 교수중손경서록(校 땝中孫卿꿉錄 ) 179 괘(卦) 106 괘사(卦辭) 106 픽 (웁~) 198-9 구가(九歌) 205-7, 219 구변 (九辯) 205-6, 208 구사(九思) 204-5 구장(九 章 ) 20 5-7 구단(九W:) 205 구회 (九 懷) 205 국사( 國 갇勘 136 국어 ( 國語) 14,42, 111, 127-131, l35-8, 142,216,218,221-2,224-5 국책 (國策) 136 국풍(國風) 17, 19, 21, 33, 36, 46, 54, 60-2,64,68-9,74,79,204 굴원부(屈原賊) 203, 205-6, 209-210 규정시(闇情詩) 59 근고문자(近古文字) 25, 232 근대 문자(近代文字) 25-6 금문(今文) 87, 114 금문상서 (今文尙 書 ) 86-90, 148 금석문(金石文) 232 기사(紀事) 95,111,145,194,224 L 납북조(南北朝) IO2 남송(南宋) 62 남풍가(南風歌) 41, 233
내전(內傳) 51, 127 내편(內篇) 168-9, 171 노(魯) 14, 42, 47, 51, 67, 80, 88, 91, 93, 96, 113, 121, 127, 144, 149, 162, 226 노고( 魯故) 51-2 노논어 (魯論語) 148-9 노설( 魯說) 52 노송( 魯碩) 47,65,67-8,91 노시 (魯詩) 51-2 노어 (魯語) 127-8 논어 (論語) 20, 43, 47-8, 88, 114, 146- 153, 156, 160, 164, 204, 215, 224-6 논어 여 설 (論語餘說) 149 논어 의 소(論語義疏) 148 논어 집 해 (論語集解) 148 논형 (論衡) 41, 233 E: 단장(短長) I36 단음절 (單音節) 230 당(Jg) 52-3, 58-60, 102, 104, 124, 155, 160, 168, 174, 176, 188, 208, 217, 221 당록부(唐勒試) 205 당서 (唐 합 ) 178 대 무(大武 • 大武舞) 66, 220 대 사명 (大司命) 219 대 아(大雅) 21, 36, 42, 43, 60, 63-8 대 언부(大言'.~) 208 대장(大 ~ ) 220 대 전 (大~) 23-6, 112, 224, 232 대 초(大招) 205-6
대 초왕문(對楚王問) 208 대하(大夏) 220 대학(大學) I47 대호(大渡) 220 덕경(德經) I75 도(道) 169-170, 175, 193, 215 도가( 道家) 18, 144-5, 168,174-5,187, 196, 21 3-4, 226, 234 도경(道 經) 175 도교(道敎) 14 도덕 경 (道德經) 175 도산가( 塗 山歌) 41 독풍우지 (없風偶識) 43 동문행 ( 東門行 ) 217 동주( 東周) 12, 14-5, 17, 22, 24, 26-7, 46-7, 61- 3 , 92, 102, 136, 145, 187, 224,228 동전(東晋) 88 동한( 東漢 ) 14-5, 26, 44, 53, 85, 88, 114, 204-5, 232, 235-6 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試) 208,216 三 Leg a cy of Chin a , The 210 口 맥 상상(阿上桑) 217 백수가@臣秀歌) 12 맹씨주(孟氏注) 168 명 (明) 41, 44, 221, 233 명 가(名家) I8, 2I3 국, 234 모시 (毛詩) 44, 52-7, 60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 52 모인(施人) 220 모전(毛傳) 53, 60-1, 63, 66, 70-1, 80 목독(木)ID 26, 28, 33, 217, 231, 233, 235 무(巫) 13, 210, 218-221 무가(巫家) 210 무부(舞賊) 208 무위 (無爲) 170, 194 북-가(墨家) 18, 144-5, 162-4,169,187, 196, 213-4, 226 문사동의 (文史通義) 43 문선 (文選) 57, 206, 208 문십조롱(文心離龍) 206 미 인부(美人賊) 216 민가(民歌 • 民諸 • 民間歌話) 17, 19- 20, 33, 41, 46, 50, 54, 61, 64, 80, 182 1:::1 박학편(博學篇) 25 반명(盤銘) 꾸 배우(俳區) 221 백서 (ma) 234 백서노자(房 깝老 子) 27 백 제 자가(白帝子lY: • 白효歌) 41, 233 백 호동의 (白虎通義) 220 법 가(法家) 18, 144-5, 187, 194, 196, 213, 226, 234 법 술(法術) 187-8, 193 변려 문(耕閩文 • lit文) 102-3, 193 번아(嬰雅) 54, 56, 63 변풍 OO風) 54, 56 별록(別錄) 217
병가(兵 家 ) 144 복거 ( 卜居) 205, 216, 220 봉건(封建 • 封建社會 • 封建制度) I3- 4, 18, 28-9, 72, 229 부(賊) 50, 102, 122, I79-180, 182-3, 185, 203, 205-6, 208, 210-1, 216, 218- 9, 222 부가(賊家) 178 부병 행 (婦病行) 2I7 부시 (賊詩) 43, 49 분서 갱 유(災 합 성[儒) 5I, 87, I97 불교(佛敎) I4 빈(幽) 60 빈풍(幽風) 6:2 - 3 人 사(史 • 史官) 13-4, 17, 19, 21-2, 28, ,43 , 46, 90-2, 94-5, I I I, I 13, 129-130, 225-6,234 사고전서 총목제 요(四 庫全古總 目 提要) 188 사기 (史記) 47, 86, 105, 1 II, 125, 128, 155, 162, 168, 174, 176, 178, 187-8, 197,207 사부(辭賊) 15, 203, 206, 210, 212, 235 사사(丸輯祚) 41, 233 사서 (四 #J ) 147, 155 사시 (四始) 54 사어 (事語) 136 사언 (四言) 79, 182-3, 193, 210 사주(四雍) 25 사회 시 (社會詩) 74, 76-8 산악(散樂) 22I
삼가시 (三家詩) 5I-3, 57, 8o 삼대 (三代) IO2, I58 삼언(三言) 79, 182 삽도본중국문학사(ii줍圖本中國文學史) 229 상(商) I2-3, I9, 42, 67, 9I, I22, 230, 232-3,236 상군서 (商君 탑 ) 194 상림 도사(桑林屈辭) 꾸 상림 부 C 七林賊) 2I6, 2I9 상명 (商&t) 42 상산채 미 무(上山采那燕) 2I7 상서 (尙 깝 ) 86, 92, 233 상서 (商 書 ) 13, 19, 90-1, 96, 233 상서 공전참정 (商 書 孔傳參正) 86 상서 대전(尙 꿉 大傳) 4I, 233 상서 정 의 (尙 密 正 義 ) 86 상송(商碩) 13, 47, 65, 67-8, 91, 233 상형 문자(象形文字) 27-8, 226, 230 상화가사(相和歌辭) 2I7 쌍성(雙聲) 50 생가(箱歌) 60 서 경 ( 書經 ) 13, I9, 21, 28, 41, 44, 62-3 85-91,82,93-6, 99, 101-3, 105-7, I 13, II5, I45, I5I, I55-6, I8o, 2I6, 2I8, 224,233 서사(敍事) 64-5, II2-3,I35,I52,2o6, 2II 서서 ( 왕序 ) 89 서정 (托情) 64, 74, 79, 206, 21I 서 정 시 (行情詩) 59, 69, 78 서 주(西周) 12, 15, 17-8, 21-4, 26궁 , 35-6, 41-2, 46-7, 61, 64-6, 80, 91-2, 102-3, 106, I 13, 136, 211, 224, 233,
236 서진(西晋) 52 서 한(西漢) 15-6, 51-3, 114, 204-5 석 고(石鼓 • 石鼓文) 23 석 명 (釋名) 31, 44 석사시명의(釋四詩名義) 63 석서(借誓) 205 선진시 대 (先秦時代) 12, 14-5, 230 -1 선문해 자(說文解字•說文) 24, 31, 44, 85 성 상(成相) 180, 182, 185 성상잠사@戈相雜辭) 182 성 선설 (性善說) I78 성 악설(性惡說 • 性惡論) 178, 188 소남(召南) 48, 56,60-2,73,80 소설가(小說家) 213 궁 · 소소還部) 220 소아(小雅) 21, 36, 꾸, 60, 63-4, 67-8 71, 77, 85 소언부(小言試) 208 소요유(達蓬遊) 169-170, 172 소전(小策) 25, 27, 29, II2, 198, 225, 232,234-5 손경 부(孫卿~) 178, 183, 205, 210 손경 서 (孫卿書) 180 손경자(孫卿子) 178 송여근) 67-8, 76, 88, 91, 96, 121, 136, 144, 147, 155, 162, 176, 178, 188, 221, 233 송(碩) 36, 꾸 -3, 46-7, 60,62,65,67-8, 77 송우부(宋玉賊) 205, 210 송원희 곡사(宋元戱曲史) 218 수문어 람(修文御登) 197
수사(修辭) 15, 18, 33-4,45,47,49-5°, 54, 79, 97, 99, 102, 112, 116, 121, 123-4, 135, 138, 145, 189, 208, 210-1, 226,228,231,235 수사고산록(洙酒考信錄) 149 수서 (修 맙 ) 136 수서 (隋Uf) 163, 178, 188, 204 순자권학편원사(荀子勸學篇究詞) 179 순전@투典) 86, 100, 233 순황집 (荀況菜) 178 습유기 (捨追記) 41, 233 시 경 (詩經) I3, I7, I9-2I, 28, 33, 36, 41-51, 53 국, 57, 59-6°, 65-9, 72-4, 76, 78-8o, 85, 9l, l0I,ll3,I48,I50-I, 155-6 , 173, 180, 182, 203-4, 210, 224, 233 시경석의(詩經釋義) 62 시 고미 (詩古微) 62, 67-8 시 기 (詩紀) 41, 233 시보(詩諸) 47 시의(詩疑) 67 시의 육의(六義) 54 시 집 전 (詩菓傳) 60, 63, 67, 73 선녀 부(神女試) 208, 216 신서(新序) 207 십 삼경 주소(十三經注疏) 86 십 익 (十翼) 106-7 。 아(雅) 46-7,54,62-4,77 아편전쟁 d 많片戰爭) 229 악부시여홍府詩) 217,235 안자춘추(是子春秋) 146
압운(押韻) 32, 50, 97, 116, 121. 176, 182-3, 193 양(梁) 57, 139, 148, 203 양경부(兩京賊) 211 양도부(兩都賊) 2ll 애 시 명 (哀時命) 205 어 부(漁父) 205, 216, 220 여 씨 춘추(呂氏春秋) 146, 175, 196- 8 , 208,225-6 역 경 (易經 • 易) 44, 106-7 여산비 (釋山碑) 25 연 (燕) 51, 63 군 36-7 연횡 책 (連橫策) I37 열자위서고(列子僞 書 考) I76 영 가지 란(永嘉之亂) 88 영대 (磁奈) I56 예 교(禮敎) 50, 59, 162 예 기 (禮記 • 禮) 41-2, 48, 88, 146, 겔 1, 197, 220, 233
예 서 (隸書) 25-6, 29, 87, 225, 232, 234-6 예 악(禮樂) I3, I 요, I64 오(吳) 24, 35, 42, 47 오경 (五經) II3, I8I 오경박사(五經博士) 52 오신주(五臣社) 58 오어(吳語) l27 오언(五言) 79 오언시 (五言詩) 2IO 오영 (五英) 220 오월춘추(吳越春秋) 41, 223 오자가(五子歌) 4l 오형(五刑) IOO 의전 OH 傳) 52, 127외편(外篇) 168-9, 171 요전(堯典) 13, 19, 86, 91, 97, 99-100, 233 용 Clh11) 60, 62 용풍 (J h1 i 風) 69 우(~) 198-9 우서(炭 밥 ) 90 우어(複語) 22I 우언(萬 言 ) I6o, I7I-3, I92, 2I6 우제 가(炭帝歌) 41, 233 우회 (後戱) 218 운몽( 店夢) 218 원(元) 122, 188 원력편(姜歷篇) 25 원유( 遠 遊) 205 월(越) 24, 35, 173 월어(越語) I27 위 (衛) 47, 60, 62, 129 군 36, 143 위 (魏) 52, 60, 102, 136-7, 141, 148 위진(魏晋) 88 위 풍(衛風) 62, 74, 76 유가({福家) • 유가사상(盤 家 思想) I4, 17-8, 50, 59, 87, 90, 92, 102, 107, 113, 115, 144-7, 149, 162-3, 169, 173-4, 178, 180-I, 187, 196, 213, 215-6, 226,234 유교(儒敎) 125 유영 씨 송(有敍氏碩) 233 유왕(幽王) 71 유학(儒學) 51-2, 155 유해 시 (遊海詩) 41, 233 육가부(陸賈賊) 205 육경 (六經) 17, 24, 43, 47, 79-Bo, 215, 233-4, 236
육경 (六華) 220 육예 략(六藝略) 213-5 육조(六朝) 197, 221-2 온(殷) 12, 23, 139, 220 온서 ( 隱書 ) 217 음양가(陰 陽家 ) 213-4 음양오행 설(陰陽五行說) 53 의례(儀 綾 ) 146 이 루(離~) 156, 158 이 소(離駿) 203, 205-7 이 소경 장구(離駿經 菜 句) 205 이 악(夷樂) 221 일본(日本) 219 입 언 (立 言 ) 144-5, 224 2 자연(自然) I70 자허 부(子 盧 試) 206, 2II, 2_1 6 , 218 잡부(雜'~) 205, 216 잡편(雜篇) 168-9, 171, 173 잡희 (雜戱) 221 장강(長江) 13, 35, 63, 80 장서 (長 뽑 ) 136 적부(笛試) 208 전영분) 53, 57 전국시 대 (戰國時代) 4, 14-5, 18, 22, 24, 29, 44, 50-1, 60-1, 63, 65, 91-2, 97, 106, Il2, Il4 군 36-7, 1~, 144-6, 155, 158, 162, 175, 178, 194, 203-4, 207-8,210-1,224-8,234 전국전무사가저 작(戰國前無私家著作) 234 전국책 (戰國策) 105, I II, 136-8, 142-
3, 175, 194, 208, 215, 218, 221-2, 224-5 전국칠웅(戰國七雄) 136-7 전기 (傳奇) 22I 전한(前漢) 149 정 (鄭) 60, u6-7, 123-5, 144, 187, 226 정대아(正大雅) 63 정성 (正聲) 63 정 소아(正小雅) 63-4 정시 (正詩) 54 정아(正雅) 63 정어(鄭語) I27 정전(鄭築) 60-1 정풍(正風) 61 정풍(鄭風) 56 제 (齊) 51,60,67,136-140, 143-4, 149, I59, l78, l9I, 2I8-9 제 논어 (齊論語) 148-9 제물론(齊物論) I69 제손씨고 0 원孫氏考) 52 재 손씨 전(齊孫氏傳) 52 제시 (齊詩) 51-3 제 어 (齊語) I27_8 제 자(諸子) • 제 자백 가(諸子百家) 4, 14-5, 18, 24, 29, 130, 142, 144-5, 155, 159-160, 169, 176, 213, 215-6, 218, 226,234 제자략(諸子略) 2I3,2I5 제자서 (諸子 if ) 214-5, 235 제잡기@羽進記) 52 제책 (齊策) 143 계 풍(齊風) 57, 72 제 후씨 고@句后氏故) 52
제 후씨전(齊后氏傳) 52 조(趙) 52, 136-7, 178 조( 曹) 60 조부( 釣!~ ) 208 종수곽탁타전(種樹郭袁院傳) 105 종정 문(鐘鼎文) 232 종족제도(宗族制度) 145 종횡 가(從 橫家) I8, I37, 2I3 좌씨 춘추(左氏春秋) I I4-5 좌전(左傳) 14,42-3,62,67, 105, Ill, Il3-7, II9, I2I, I23, I25, I27_3I, 135-8, 142, 151, 153, 204, 216, 218, 221,224 주(周) 12-5, 23-4, 27, 55, 61, 63-4, 66, 77, Bo, 90-1, 94, 106-7, 116, 129, 137-40, 143, 217, 220-1, 224, 228, 230,232-3,236 주( 錦 • 摘書 ) 23-4, 28, 224, 232-3, 236 주남(周南) 48, 55, 60-2, 80 주례 (周禮) 146, 220 주서 (周 합) 9o-3, 95-6, 103, 233 주송(周碩) 63-6, 68, 77, 91, 233 주송설(周碩說) 61 주어 (周語) 127-9 죽간(竹簡) 26, 28-9, 33, 99, 208, 217, 231,233,235 중국대 문학사(中國大文 學史 ) 229 중국시 사(中國詩史) 62 중산(中山) I36 중용(中庸) I47 중원(中原) 63-4, 67 지 괴 (志怪) 221-2 지 괴 소설 (志怪小說) 160
진 (陳) 42, 60, 76 진(晋) IO2, II7, I23-5, I37, I68, I76, I98- 9 진 ( 秦 ) I5, 26, 511 60, 63, 88, 1021 119- 1 20, 123-5, 136-9, 146, 187, 196- 7, 226, 230, 232 진시 (陳詩) 42 진십 (盡 心) I56 진어 ( 晉語 ) I27, I3I 진전( 秦菜 ) 25, 334 진책 ( 秦策 ) I42 전학 해 ( 進學 解) I24 진한시대 ( 秦漢 時代) I3 궁, 18-9, 22, 92, 226 Chank u o Ts's Fic t i on , The 216 云 창우({點夏) 218 창힐편(倉領篇) 25 재미가(採 薇 歌) I2 채 시 지 관( 採 詩之官) 42-3 천문( 天 「h i ) 205-7 첩 운( 姓韻) 50 첨 자( 姬 字) 50 청( 淸 ) 43,88, 114, 158, 206-7, 221, 229 초( 楚 ) 나, 24, 35, 51, 67, u7, 136-7, 139, 141, 144, 162, 174, 178, 185, 198, 203-4, 208, 210, 218-9, 225-6 초가 어분歌 ) 204, 208 초사 G 츈辭 ) 185, 203-7, 209-11, 216, 2I9 초사 G 촌詞) 204
초사강의 (楚辭 講 義) 207 초사작어한대고( 楚辭 作於 漢 代考) 207 초사장구 G 똔辭菜 句) 204-6, 208 초서 ( 草법 ) 26 초성 G 老聲 ) 204 초어 ( 楚語 ) • I27 초은사(招 [홍 士) 205 초중경처 ( 魚 仲 卿妻 ) 2I7 초혼(招§J R) 205-61 208 춘추( 春 秋) 15, 44, 53, 90-1, III, I I 3-5, I28 춘추곡량전( 春 秋 穀梁 傳) III 춘추공양전( 春 秋公 羊傳 ) III 춘추번로 (春秋繁露 ) 86 춘추시 대 ( 春秋時 代) I5, I7-8, 24, 26, 28,35,41- 3 ,47-8,5o,6 3 ,66, 77, 79-8°, 90,97, 112-4, 137, 144,225-7 군 33 춘추좌씨 전 ( 春秋 左氏傳) I I4-5 취 향기 ( 6' f鄕記 ) 103-4 칠간(七 練 ) 205 칠략(七 略) 205 칠언시 (七 言詩 ) 21 0 E三 란가( 彈歌 ) 41, 233 태사Q S 史) 23-4, 174,224,232-3,236 끄 패 (:IHI) 60, 62 패 풍(jtli風) 76 풍 00 54, 60-2, 64, 67 풍 aID 61
풍간(誤練) 43 풍부(風賊) 208 풍부(誤lfjl;) 208 풍아광일@訪佳廣逸) 41, 233 풍아일펀 @M 雅逸篇) 4I 풍유(誤諭) 33, 60, 151, 228 풍자( 誤 刺) 6o,64-5,71,77,79 필힐(佛ll'f) 150 O-_ 하(夏) 19, 41, 63, 124, 230, 233 하시 (夏 書 ) I3, 19, 86, 901233 하인가(夏人歌) 41 한(漢) 14-6, 19, 26-9, 31, 34, 51-2, 57, 61, 72, 79, 80-1, 86-9, 102, 106, u4-5, 122, 125, 1361 146, 148, 151, 155, 162, 168, 174, 176, 178, 180, 182, 185, 188,204-12,214, 216-7, 222, 225, 230 한(韓) 136-7, 189 한고(韓故) 52 한내전( 韓 內傳) 52 한부( 漢 試) 15, 182-3,185,203,205-6, 209-I2 한비자보전(韓非子補姜) 189 한서 (漢 書 ) 18, 42, 52-3, 105, l II, II3, I25, I47-8, I63, I68, I76, I78-9,
182-3, 188, 194, 203, 205, 210, 213, 216, 234 한설( 韓 說) 52 한시( 韓詩 ) 51-2 한시 의 전 ( 韓詩 外傳 • §韋 外傳) 41, 52 함지 (咸池) 220 합종책 (合 縱策 ) 137 해 서 ( 借書 ) 26, 232, 235 행 서 (行 書 ) 26, 235 행역 (行役) 113 허구(虛精~ ) 94,96,106,II1,II9,123-4, 138, 156, 159, 172, 215-7, 226 현시 ( t狀 詩) 42 협 운(協韻) 49, 67 형 명 (刑名) 187-8 효(!it) 106 효경 ( 孝經 ) 88, 146 효 사(交 辭 ) 106 화립편략(華 林福略 ) 197 화본( 話 本) 221 황로지 학( 黃 老之 學 ) 51 황아가(皇峨歌) 41, 233 황하( 黃 河) 13-4, 74-5, 8° 회 ( 檜 ) 60 회 남자(淮南子) 197 후한(後 漢 ) 148, 206, 후한서(後 漢書 )
金 學 主 서 울大學校 文理大 中文科 卒業 國立갚閑大學 國文硏究所 卒業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 미국 프린스턴大學에서 硏究 주요저서 「中國文學槪論」 「中國文忠史」(共著) 등 현재 서 울大學校 中文科 敎授
 己,..?
己,..?
中國古代文學史 1983. 11 . 1'.> 초판 1987_ 3. 10 3 판 저자金學主 발행인 朴孟浩 발행처 民 音社 우편번호 llO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 의 l 734-2000 • 735-8524 • 734-4234 출판등록 1966, 5, 19 0) 1-336 호 값 3, 800 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 니 다.
인문사회과학 麟語의系統 金芳漠/값 2800 원 文學ih 衍學 김 현 / 값 3200 원 商周史 尹乃鉉 / 값 5, 700 원 人間의短能 黃 禎 奎 / 값 6,600 원 中國古代文學史 金學主 /값 3 , 800 원 B 本의萬葉集 金思燁 / 값 3200 원 現代意昧論 李益煥 / 값 4200 원 베트남史 劉仁 善 / 값 320 0 원 印度哲學史 吉熙星 / 값 4500 원 輔램의風水思想 崔昌祚 / 값 5000 원 社會科學과數學 李承勳 外 / 값 2 , 500 원 重 商主義 金 光洙 / 값 2 100 원 方言學 李翊燮 / 값 3, 400 원 構造主義 蘇斗永 / 값 3,400 원 外交制度 史 金洪喆 / 값 2900 원